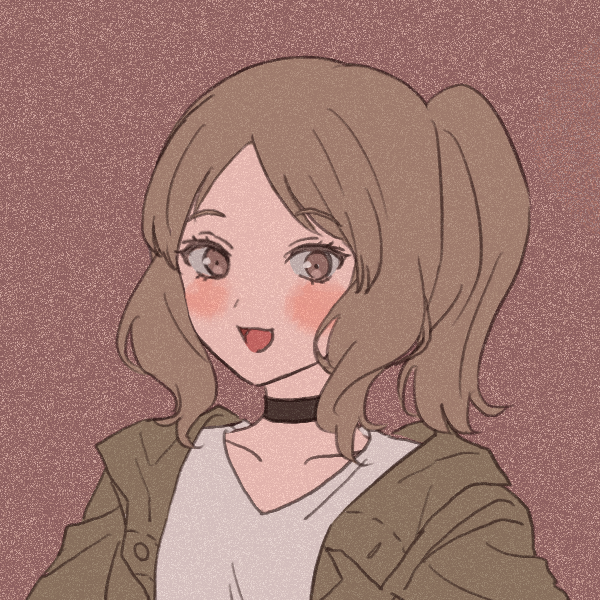>1457361678> 자유 상황극 스레~1 (1001)
익명의 참치 씨
2016. 3. 7. 오후 11:41:18 - 2020. 11. 13. 오후 3:46:33
-
0 (41E+42) 2016. 3. 7. 오후 11:41:18
-
1 이름 없음 (759E+58) 2016. 3. 7. 오후 11:44:46옆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테지만 잘 모르는 참치들을 위해!
이 스레는 정말 말그대로 '자유 상황극' 이야. 시트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돼지. 어떠한 상황극이라도 허용!(물론 19금 묘사같은건 안되겠지?)
아주 짧아 금방 끝나는 개그 상황도 괜찮고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도 좋아. 누군가 하고싶은 상황을 레스로 올리면 아무나 그것을 이어주는거야! 그렇게 생긴 파트너끼리 내용전개는 알아서ㅇㅇ
돌리다가 또다른 장편이 나올 것 같으면 새로 스레 하나를 파서 시트쓰고 돌리도록! -
2 이름 없음 (759E+58) 2016. 3. 7. 오후 11:46:31+)
A와 B가 이미 돌리고 있는 상황에 또다른 누군가, C가 한 마디 상의없이 갑툭튀로 끼어드는건 노매너:) -
3 이름 없음 (42865E+56) 2016. 3. 7. 오후 11:53:54음... 자유상황극이라... 1:1 상황극이랑은 혹시 어떤점이 다른거야?
-
4 이름 없음 (13051E+58) 2016. 3. 8. 오전 12:02:04>>3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시트 없이 상황극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일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A가 이런 레스를 올리면,
A- ["좋아, 모험이다!!"
그렇게 패기롭게 외친 소년은 집 밖에서 열 걸음도 채 가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귀를 붙잡히고 말았다.]
그럼 이 상황에 맞춰서,
B- [ "가더라도 구X 숙제는 하고 가! 선생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하는거니!!"
그의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채 아들의 귀를 힘껏 잡아당겼다. ]
이런 식으로 시트없이 돌리는거야.
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되니...? -
5 이름 없음 (13051E+58) 2016. 3. 8. 오전 12:03:03아이디가 바꼈네... 참고로 난 >>1이야
-
6 이름 없음 (0054E+55) 2016. 3. 8. 오전 12:04:13아하... 한 방에 이해되었어!! 설명 고마워!
-
7 이름 없음 (13051E+58) 2016. 3. 8. 오전 12:14:24>>6 ......(부끄
-
8 이름 없음 (98159E+56) 2016. 3. 9. 오전 12:43:28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 서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듯한 회색의 돌무덤을 하염없이 보고있다가 하얀 국화와 데이지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무덤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소리없이 울기만하다가 뒤늦게 바로 당신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당황한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
9 이름 없음 (38069E+65) 2016. 3. 9. 오후 6:28:35>>8
그녀의 질문을 들었음이 분명한데도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가슴깊이까지 파고드는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펼쳤다.
"...감기걸려."
정작 본인 쪽으로는 전혀 기울이않은 채로, 오직 그녀에게만 우산을 기울인 채로 그는 얼른 받아들라는 듯 우산을 내밀었다. -
10 이름 없음 (41817E+60) 2016. 3. 9. 오후 6:33:47>>9
"저기..."
라고 하려던 차에 자신을 향해 씌워진 우산을 본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우산을 쓰고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준 그에게 우산의 절반을 씌워주었다.
"...고마워요."
하나밖에 없던 가족에 대한 얘기라든가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왓던 여기까지 그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막막한 심정 등등 하고싶던 말이 두서없이 가득 생각이 나지만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한 것 외에는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
11 이름 없음 (84497E+57) 2016. 3. 9. 오후 6:38:26밥을 차렸다. 그런데 네가 오지 않는다.
핸드폰을 열어 한참을 네 사진을 바라보다가 네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눈물이 떨어져 터치가 잘 안되자 꾹꾹 눌러쓴 한 마디의 말.
보고싶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작성 버튼을 힘겹게 누르고서야 네가 더이상 없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다. -
12 이름 없음 (41817E+60) 2016. 3. 9. 오후 6:50:58>>11
"...49제도 지났다고 하니까 지금쯤 좋은 곳에 있을거야."
주변인인 자신은 해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휴지만 한웅큼 집어서 건네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 -
13 이름 없음 (38069E+65) 2016. 3. 9. 오후 7:02:09>>10
자신에게 절반 씌워진 우산을 잠깐 멍하니 보다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젖어있는 뺨이 차가워보였다. 그 뺨을 감싸고 싶은 충동이 순간 들었지만 주먹을 꽉 움켜쥠으로 참아낸다.
난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소리내서 울어도 돼."
고민 끝에 흘러나온 말이었다.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녀가 안타까웠던걸까.
그는 그녀의 손에서 우산을 살며시 빼내어 자신이 들었다. 우산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참을 필요 없어."
그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
14 이름 없음 (48337E+63) 2016. 3. 9. 오후 8:38:49>>13
많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찰나같이 긴 시간동안 시선 하나로 교차하며 엮이였었다.
차가운 비가 톡. 톡 하면서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주변을 꽉 매워서 그 자리에 고요만이 남을 것 같았다.
그 순간에 그녀는 결국 그의 옷깃을 살며시 쥐어잡는가 싶더니 구명줄이라도 되는양 그것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죽었어... 죽었다고요!! 몇년동안 침대에 꼼작없이 누워있을 수 밖에 없던 내 동생이... 그 불쌍한 애가 결국 단 헌번도 눈을 못뜬채 죽어버렸어... 사고 이후로 나한테 남은 사람은 그애뿐이였는데... 난... 이렇게 될 일이였는데 난 지난날동안 도대체 뭘 위해 여기까지 버틴걸까 전혀 모르겟어요... 앞으로 이제 또 뭘 어뗗게 해야할지도 하나도 생각 안나고... 그애가 너무 불쌍하기만 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처럼 이렇게 외롭고 끔직하게 느껴지던 적이 없었어요..."
속에 있던 울분을 타뜨리듯이 말하는 그녀의 숙인 고개와 어깨가 바들거렸다. -
15 이름 없음 (12962E+58) 2016. 3. 10. 오전 11:45:51"대체 몇 번을 찔러야 죽을 생각이야……."
청년은 질렸다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킁, 코를 훌쩍이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팔소매로 훝고나서는 발치에 누워있는 시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시체였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리라. 분명 맨 처음 시신경을 잘라내 분리했을 터인 눈동자가 어느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조금 깔보여지는 것 같아 분해진 청년은 볼을 부풀렸다.
"내 기념비적인 100번째 살인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다니, 난 이 이상 뭘 위해 살아가면 좋은거야. 대답해봐, 불사신." -
16 이름 없음 (36541E+55) 2016. 3. 10. 오후 1:54:47>>15
쿨럭...
계속 회복되어가는 몸 안에 고인 죽은 피를 뱉어내며 간신히 되돌아온 시야로 보이는, 자신의 옆에 앉아서 잔뜩 불만을 풀어내는 살인마를 보며 비실비실 웃었다.
"미친자식... 멀쩡한 남한테 칼침 놓고서 왜 그런걸 물어?"
거 두럽게 아프네 싶어서 아래를 보니 고급스러운 코트랑 명품 옷들이 끔직하게 엉망이 되어 붉은색이 되어버렸다.
"하? 이 코트가 얼마짜린줄이나 알아? 이것들이 다 얼만데 이꼴로 만들어놔? 너야말로 내 옷 어쩔거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만 상체를 끄응거리며 들어올려 신경질적이게 노려본다. -
17 이름 없음 (67946E+55) 2016. 3. 11. 오전 11:20:34
"아가 ! 어떻게 회사에 온거야 ?"
남성은 , 아이와 키를 맞춰 앉으면서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인자한 보라색 눈동자로 기분좋게 응시하던 남성은 . 자신의 2배쯤 되보이는 장갑을 낀채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보이고선 . 작업용 눈 보호대를 쓰고서는 일하러 발걸음을 옮겼다. 화상탓에 잠시 뜨거운지 표정을 찌푸렸다가 아이가 걱정할까봐 웃어보여
"위험하니까, 따라오면 안돼 알았지 ?"
-
18 이름 없음 (0727E+50) 2016. 3. 11. 오후 2:31:10>>17
"아빠가 너무 보고싶어서 명함 보여주면서 어른들한테 길을 물어봣어!"
인자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다가 커다란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가 쓰다듬어지자 아이는 즐거운 것인지 맑은 소리로 꺄르르르 웃으며 자신의 아빠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요... 여기 딱 서서 기다릴게! 빨리 와요 아빠!" -
19 이름 없음 (67946E+55) 2016. 3. 11. 오후 2:44:07>>18
"...."
누구 아이인지 몰라도 . 참 예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성숙하고 . 말잘듣고 똑똑하고 . 사랑스럽고 그외 등등하다. 한번에 힐링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하려던것을 멈추고서는 . 아이한테 달려와서 . 안아올렸다 . 과연 내가 만든 아이가 맞을까 고민될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에 . 껴안고서는 볼을 부비적 거렸다. 뒤에서는 동료들이 필불출이라고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쓰지않고선 아이의 볼을 부비적 거리다가. 뜨거운 감촉에 표정을 찌푸렸다. 이런
"아빠 가기싫어어..더있고 싶다고 !"
하지만 이내, 동료들한테 끌려가버린다. -
20 이름 없음 (47117E+55) 2016. 3. 15. 오후 11:32:49굽이진 달동네의 골목들을 지나쳐가며 소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숙였다. 발소리를 줄이려는 이유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 띄일까에서이기도 했다. 아직 한낮이지만 허름한 건물들과 의욕없는 사람들 사이에선 퇴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전체적으로 어두워보였다. 소년 역시 꾀죄죄한 옷이었으나 얼굴만은 막 씻은 얼굴처럼 말끔했다. 초조해하면서도 기대감을 안은 표정으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아, 하아…….”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다. 허름한 나무판자가 벽에 뉘여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소년은 여전히 반짝이는 눈으로 판자를 치워냈다. 그러자 벽에 뚫려있는 작은 개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구멍 안에 기어들어가자 소년은 허한 잡동사니점 안, 새장 속에 갇혀있는 작은 요정을 볼 수 있었다. 판매용으로 걸어놓은 새장의 철창 가까이로 다가간 소년은 걱정스런 눈을 했다.
“…나 왔어. 기다렸어? 몸, 아직도 아파?” -
21 이름 없음 (50196E+59) 2016. 3. 21. 오전 4:39:35갱신
-
22 이름 없음 (64199E+50) 2016. 3. 21. 오후 8:35:03>>20
요정은 소년이 오자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철창 너머 소년에게 손을 뻗어 소년의 얼굴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쓸었다. 그 손은 부드러웟으며... 아주 차가웠다. 눈의 요정이여서 어쩔 수 없었다. 요정이 소년을 마음에 들어했으므로 겨울이 있는 나라로 떠나는 동료들을 보내며 그의 새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가 이렇게 되는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그 요정은 마치 보고싶었다는듯이 날개를 팔랑거려서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내며 날개에서 은빛의 눈가루... 그러니까 요정가루를 새장 한 구석에 조금씩 흘려갔다.
날씨가 따뜻해져간다. 아마 이대로라면 요정은... -
23 이름 없음 (13788E+55) 2016. 3. 21. 오후 9:06:14>>22
그녀가 여기에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처럼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처음과는 비교될 정도로 달라진 그녀가 흘리는 반짝거리는 가루들의 모습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볼에 닿은 그녀의 감촉은 서늘했으나 오히려 모닥불보다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작은 손 위에 소년도 손을 겹쳤다.
“…얼음을 가져왔어. 개수는 얼마 안되지만…”
미안해, 라는 말을 꾹 삼킨 채 소년은 내뱉듯이 말했다. 날개가 팔랑거리며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빙그레 웃어보이며 소매 속, 봉지에 담겨있는 얼음을 꺼내보였다. 소년의 체온에 조금 녹아있었으나 형태는 온전했다.
“아무도 안왔었어?”
그 얼음을 새장에 넣으려 자세를 바꾸려다 밀려온 아픔에 눈가를 찌푸렸다. 이 동네에서는 희귀한 얼음을 훔치다 경비견한테 물린 종아리 쪽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이 일부러 말을 꺼냈다. -
24 이름 없음 (64199E+50) 2016. 3. 21. 오후 9:28:34>>23
소년이 요정에게 위안을 얻는것 처럼 요정또한 소년이 자신을 보러 와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베시시 웃었다. 그녀는 점점 더 따뜻해지는 날씨를 어렴풋이 느끼기야는 했지만 소년이 갖고 온 얼음을 보자 그래도 겨울의 끝자락에 있기는 있는가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보다는 큰 얼음을 두 손으로 끙 차 하고 받아잡고 날개짓을 팔랑거려 새장 안에 두고 그 위에 앉아 끄덕였지만 어딘가가 이상해보이는 소년의 기색에 걱정스럽다는듯이 새장으로 가서 최대한 소년에게 가까히 가려고 했었다.
괜찮아요? 정말로...? 어디 다치거나 한건 아니죠? 난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어줄 수 없는데... 슬퍼하게 될 당신이 너무 걱정돼... -
25 이름 없음 (45223E+55) 2016. 3. 22. 오전 7:57:48>>24
소년은 요정의 행동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작고, 아기자기하고, 반짝거리며 빛나고……전부 이 마을과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가난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이곳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렇기에 알고있다. 이 마을의 주민이 그녀를 찾게된다면, 분명 그녀를 팔아치울 것이다.
“…괜찮아. 그저 너를 계속 외롭게 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말야, 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
소년은 소녀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을테지만 본인이 들뜬 목소리를 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곪아가고, 얼음 주인한테 들키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얼음창고에 갇혀 죽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긴 아니야. 소녀가 뻗은 손에 어리광부리듯 머리를 부비적거렸다. -
26 이름 없음 (44243E+52) 2016. 3. 22. 오후 2:39:01>>25
자신을 너무 외롭게 한 것같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소년을 보자 화들짝 놀라서 전혀 외로워 하지 않았다는듯이 고개를 도리질쳤지만 곧 자신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대는 소년을 자신의 한참 작은 두팔을 벌려 꼬옥 껴안아주며 그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요정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소년을 보며 매번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걱정을 하였다. 결국 봄이 된다면 자신은 녹아죽을 것 이였다. 수많은 겨울을 따라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녀에게 지난 삶들은 딱히 아쉬워 할 일이 없었다. 모든 얼어붙은 것들과 얼어붙어가는 것들 사이만 돌아디니었기에 햇살에 반짝이는 눈들과 고드름, 앙상한 나뭇가지 위의 새하얀 눈으로 된 꽃들이나 포근하고 하얗기만하던 경치들을 그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날아다니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보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 동물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놀았던 그 삶이 재미있었으니까. 그리고 잿빛에 가까운 삭막함이 둘러쌓인 마을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알아보던 이 소년의 곁에 있던것이 무척 좋았으니까... 하지만 봄이 오고 자신만이 혼자 남았을때는? 그땐 혼자 남을 소년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게 그녀에게는 살짝 두려울 뿐이였다.
딸랑- 짤랑-
걱정을 떨치려는듯 날개짓을 하자 자신의 날개에서 나온 가루가 얼음에 닿아 작은 눈꽃을 만들다가 녹았다. -
27 이름 없음 (65052E+56) 2016. 3. 22. 오후 3:05:37>>26
자신의 머리를 쓸어주는 감촉에 소년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미소를 남몰래 지었다. 소년 나잇대의 어린아이가 평상시와 같이 지니고 있어야할 그 순수한 미소는 적어도 소년에겐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와 만난 뒤로 바뀌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자신도 투명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그런 나였더라도 너와 친해질 수 있었을까.
‘고마워, 좋아해.’
마치 봄이 다가올수록 마음 속에 응어리 져가는 불안감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그녀에게 품은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납득하려는 것처럼. 그녀가 만들어낸 그녀를 닮은 은색 아름다운 모습의 눈꽃이 녹아가는 것처럼.
목까지 올라온 말을 삼킨 채,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러던 소년은 문뜩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하늘을 닮은 푸른색 요정의 날개 끄트머리가 묘하게 흐뜨러진 것 같아서.
“날개……어디 아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자신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소년이 성장한다면 감금얀데레가 되지 않았을까 ‘ㅅ’*.... -
28 이름 없음 (74083E+53) 2016. 3. 22. 오후 3:36:06>>27
요정은 자신의 말이 소년에게 들릴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웟다. 내가 만약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호기심에 차서 친구들은 가지 않던 잿빛같은 마을에서 소년을 만났을때 얼마나 반가웟는지를 말 해 주었을 텐데. 소년이 미소를 지을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려줄텐데... 가끔씩 들리는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소리라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때마다 불안해하는 소년에게 노래라도 불러줄텐데...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는 소년에게 그동안 돌아다녔던 그 많은 겨울에 대하여 들려줄텐데... 소년의 이름을 많이 불러줄텐데. ...하고싶은 말이 정말로 많은데.
그러다가 소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날개를 가리키자 흠칫 놀라면서 자신의 날개를 본 요정은 필사적으로 날개를 움츠리며 두 손을 뒤로 빼어 날개를 가린채 고개를 붕붕 가로젓는다.
아냐아냐! 진짜 안아파! 나 건강해! 라는듯이 소년이 갖고 온 얼음에 기대었다.
--------
엄... 이미 감금물... 이구나! 그러고보니 얀데레라는 생각을 못 했네. 길어질 것 같은데 따로 어선을 만들까? -
29 이름 없음 (30068E+54) 2016. 3. 22. 오후 3:45:39음, 40까지만 진행해보고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어선을 만드는게 좋겠다 XD!
ㅎ....ㅎㅎㅎㅎ.....예비 범죄자.......o<-<.....저녁에 다시 돌아올게! -
30 이름 없음 (96528E+61) 2016. 3. 23. 오전 6:31:51>>28
소년은 요정의 당황한 듯한 기색에 눈을 깜빡거렸다. 마치 눈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음에 기댄 그녀를 쳐다보았다. 녹아가는 얼음……. 어째서 그녀의 모습이 겹쳐서 보인걸까. 소년의 표정이 겁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점점 지쳐가고있다는 막연한 불안함은 있었다. 그러나 외면하고 있었다. 전부 상상력으로, 억지나 다름없는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
“……얼음. 기, 기다려줘. 나, 금방…금방 다녀올테니까.”
소녀의 날개는 소년의 안일한 사고를 돌려놓을 정도로 충격이 큰 것이었다.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을 안고있는 것만 같은 초조한 심정으로 자리서 박차일어났다. 파래진 얼굴로 자신을 다독였다. 얼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될거야. 흉폭하고 굶주린 개들도, 잔인한 얼음 주인도 상관없어.
“널 잃고싶지 않아…….” -
31 이름 없음 (05215E+61) 2016. 3. 23. 오전 8:31:36>>30
총! 총! 총!
소년이 새파래진 얼굴로 다리를 절뚝이며 재빨리 사라져버리려고 하자 요정소녀는 불안한 기분을 감추지 못 하고 철창을 두드리며 소년에게 가지말라는듯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얼굴로 고개를 내저었다. 가지 마...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어쩐지 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소년이 사라져버리자 요정은 불안한듯이 팔랑거릴때마다 종소리가 나는 날개를 따르릉 따르릉 거리듯이 파르륵거리며 자신이 그동안은 소년의 당부와 약속때문에 열지 않았던 새장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 어떻게든 말을 해야만 했다. 봄은 봄대로 세상이 따뜻해지면서 눈을 뜨고 여름은 여름대로 모든것이 뜨겁고 무성하게 자라오르며 가을은 모든것의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결실을 맺어가고 겨울은 모든것이 얼어붙어 잠에 빠지고 다만 계절의 요정들은 자신의 계절에따라 온 생을 보낼 뿐이라는것을 알려주어야만 하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소년에게 모든것을 숨기지 말고 알려주고 당부시켜주어야 하는편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
그나저나 정말 얀데레의 기질이 있다면 저기에 자물쇠까지 걸어놧으려나. -
32 이름 없음 (96528E+61) 2016. 3. 23. 오후 1:48:39>>31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에, 불안해하는 표정에, 소년은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짓는걸 본 적이 없다. 자신이 울린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이다. 소년은 양손을 꾹 주먹 쥐고서 입을 뻐끔거렸다. 미안, 나는 역시 너가 없으면 안돼. 그 아무도 얼음이 있다면 요정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심적으로나마, 육체적으로나마 자신이 매달릴 구 있는건 이것 뿐이었다. 그렇기에 소년은 힘겨워하는 얼굴로 몸을 돌린 채 비밀통로를 통해 얼음 가게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곳을 지키는 커다란 개도, 주인도 무섭지만 지금만큼은 겁나지 않았다.
“흐우, 흐우…”
쉴 새 없이 달려 얼음가게 주변 모퉁이에 멈춰서서 가게를 살폈다. 이내 소년은 놀란 표정을 지어보였다. 개도, 주인도 없다. 그러나 가게 문은 열려있다. 소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곤, 가게로 숨어들어갔다. 그 이후는 너무나 수월했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얼음들을 담고, 튕기듯이 뛰쳐나갔다. 자신은 여태껏 그렇게 열심히 달려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달린 탓인지, 그녀가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소년이 지나간 곳의 체취를 맡으며 이빨질을 하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개만이 소년이 뛰어간 곳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 나 왔어! 하아……후, 으.”
소년은 곧바로 자리에 풀썩 쓰러져 거치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손에는 얼음이 가득 들린 봉지를 들고, 눈만은 요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웃어보였다. 긴장이 풀리고, 나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쩐지, 피곤해….
/오히려 자물쇠 같은걸 안걸아도 못나갈거란걸 알고서 한거라면.....소오름 o0o;;; -
33 이름 없음 (16841E+55) 2016. 3. 23. 오후 5:53:38>>32
요정은 안절부절하면서 샤장의 걸쇠를 풀려고 낑낑거리며 걸쇠부분을 붙들고 날아오르려고 하였다.
딸랑 딸랑(파득 파득). 쿵. 딸랑 딸랑 쿵.
엉덩이가 아파졌을 때, 익숙한, 하지만 다급한 발걸음이 들려오면서 헉헉거리는 소년이 나타났을 때 요정은 간신히 걸쇠를 열고 새장을 나와 자신보다 훨씬 큰, 아마도 몇년이 지나면 더욱 더 커질 소년에게 매달리듯 안기어 껴안아버렸다. 처음에 소년이 자신을 보이는것이 신기해서 소년이 내미는 손끝을 잡자마자 뜨거워서 멀리 떨어졌을때와는 달리, 오래 있으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손을 잡거나 껴안아주거나 쓰다듬듯이 서로의 살이 닿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라진 고통 뒤에 자리잡게된... 자신은 느껴보지 못 하였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주는 안도감과 걱정, 연민 등등... 그녀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뱅글거리는 통에 어지러울 지경이였으나 그녀는 소년이 무사한지를 살피기 위해 소년의 몸 위를 약해진 날개를 힘껏 혹사시켜서 돌아다니다가 빨간 것이 나오는 다리를 보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였다. 순수하게만 자라온 그녀라도 죽음과 상처정도는 알고 있었다. 아아... 나때문에... 아팟을텐데 이렇게 무거운 얼음까지 들고 뛰어버린거야...? 나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녀는 끔직한 상처에 인상을 찡그렸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미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 소년이 아픈것에서 오는 슬픔때문에 표정이 슬프게 일그러졌다. 소년의 다리에 있는 곪아가는 상처 위에 살며시 앉아 부드럽게 그곳을 쓸어주다가 아무것도 못해주었던 무력감에 날개끝부터 발 끝까지 몸을 떨었다. 자신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눈물과 요정가루가 소년의 상처를 옅게 뒤덮을때까지 그녀는 울기만하다가 그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사아악.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가까히서 본 적이 없는 그녀였기에, 그녀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그동안 전혀 써본적이 없어서 쓰지 못 했던 눈물과 요정가루가 만든 기적이 소년의 심각한 상처를 없애고 미미한 멍자국과 비슷한 무언가를 그 자리에 대신 남겨버렸다는 것을 모른채 잠이 들어 버렸다.
--------
...무서운 아이! 근데 잠깐.... 근데 새장을 열었잖아? 일어나보니까 자물쇠가 채워졌다 라든가 그런 전개가... (설마설마설마) 엄 진지한 중인데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타락한 것 같아. 순수한 순애...혹은 가슴저리는 최류물인데 우리 범죄물 찍고있어. (당연히 양심의 가책따윈 없다.) -
34 이름 없음 (16841E+55) 2016. 3. 23. 오후 5:54:10>>32
요정은 안절부절하면서 샤장의 걸쇠를 풀려고 낑낑거리며 걸쇠부분을 붙들고 날아오르려고 하였다.
딸랑 딸랑(파득 파득). 쿵. 딸랑 딸랑 쿵.
엉덩이가 아파졌을 때, 익숙한, 하지만 다급한 발걸음이 들려오면서 헉헉거리는 소년이 나타났을 때 요정은 간신히 걸쇠를 열고 새장을 나와 자신보다 훨씬 큰, 아마도 몇년이 지나면 더욱 더 커질 소년에게 매달리듯 안기어 껴안아버렸다. 처음에 소년이 자신을 보이는것이 신기해서 소년이 내미는 손끝을 잡자마자 뜨거워서 멀리 떨어졌을때와는 달리, 오래 있으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손을 잡거나 껴안아주거나 쓰다듬듯이 서로의 살이 닿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라진 고통 뒤에 자리잡게된... 자신은 느껴보지 못 하였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주는 안도감과 걱정, 연민 등등... 그녀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뱅글거리는 통에 어지러울 지경이였으나 그녀는 소년이 무사한지를 살피기 위해 소년의 몸 위를 약해진 날개를 힘껏 혹사시켜서 돌아다니다가 빨간 것이 나오는 다리를 보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였다. 순수하게만 자라온 그녀라도 죽음과 상처정도는 알고 있었다. 아아... 나때문에... 아팟을텐데 이렇게 무거운 얼음까지 들고 뛰어버린거야...? 나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녀는 끔직한 상처에 인상을 찡그렸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미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 소년이 아픈것에서 오는 슬픔때문에 표정이 슬프게 일그러졌다. 소년의 다리에 있는 곪아가는 상처 위에 살며시 앉아 부드럽게 그곳을 쓸어주다가 아무것도 못해주었던 무력감에 날개끝부터 발 끝까지 몸을 떨었다. 자신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눈물과 요정가루가 소년의 상처를 옅게 뒤덮을때까지 그녀는 울기만하다가 그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사아악.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가까히서 본 적이 없는 그녀였기에, 그녀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그동안 전혀 써본적이 없어서 쓰지 못 했던 눈물과 요정가루가 만든 기적이 소년의 심각한 상처를 없애고 미미한 멍자국과 비슷한 무언가를 그 자리에 대신 남겨버렸다는 것을 모른채 잠이 들어 버렸다.
--------
...무서운 아이! 근데 잠깐.... 근데 새장을 열었잖아? 일어나보니까 자물쇠가 채워졌다 라든가 그런 전개가... (설마설마설마) 엄 진지한 중인데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타락한 것 같아. 순수한 순애...혹은 가슴저리는 최류물인데 우리 범죄물 찍고있어. (당연히 양심의 가책따윈 없다.) -
35 이름 없음 (09917E+58) 2016. 3. 24. 오후 1:58:57몽롱한 감각이 전신을 덮쳐오고, 싸늘하던 바닥의 감촉은 사라진 디 오래였다. 있을 리 없는 어머니의 품 속이 떠올랐다. 자신은 기억이 남아있을 적부터 또래의 아이들에게 구두닦이와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그들에게 반납했어야했다. 마음을 나눌 사람조차도 없었다. 빙글빙글 도는 꿈 속의 자신은 소년이 보아도 꽤나 고독해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소년의 표정이 생기가 돌아온 것은. 그녀가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에게 와줬기에. 아직도 그 첫만남을 잊지 못한다. 소매치기를 하다 잡혀 멍투성이가 된 볼썽 사나운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먼저 내게 다가와줬다. 잿빛으로 가득찬 모노크롬의 세계에 그녀를 중심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쩐지, 그녀라면. 그녀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꿈 속의 내용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건 자신의 꿈이 아니다. 의식이 다른 누군가와 작은 실을 통해 이어져있는 감각. 상대방의 꿈 속은 새하얀 마법의 세계였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어른들도 없으며, 밤하늘엔 영롱한 별의 길이 쭉 펼쳐져있었다. 그래, 이건 그녀의 꿈이구나. 소년은 슬며시 꿈 속에서 웃으며 천천히 각성해가는 의식 속에 마지막 꿈을 꾸었다.
—따듯해져가는 날씨, 녹아가는 얼음, 최후엔 그 형체마저 없어져 가서는, 이 세계에, 그리고 소년에게 질려 떠나가는 작은 날갯짓, 오히려 그것이 잘 된 일일지도, 아냐 제발 가지마—그리고 암전.
“…….”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눈을 슬며시 뜨면 이미 해는 지고 농후한 어둠만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소년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커다래진 눈으로 고개만을 돌려 새장을 바라보았다. —없다. 그녀가, 없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로 있는 소년의 눈가에 커다란 줄기의 눈물이 왈칵 솟아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결국 넌 여기에 있어야 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꿀렁꿀렁 흐르는 눈물을 팔로 훔쳐도 멈추지를 않았다. 그래도, 그래도. 그녀와 조금만 더 같이 있고싶었어. 이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일찍 알아채고 가버린 것일까. 한참을 누워있는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리 쪽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곪아있던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도 없었다. 이게 대체……소년은 상체를 일으켜 자신에 다리에 기대어 누워있는 요정의 모습을 발견했다. 환상? 아니면, 꿈의 연장선? 소년은 믿을 수 없단 심정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에게 닿았다. 자고있는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겨주었다. 상처가 나아있았고, 그 주변엔 고운 눈가루가 뿌려져있었다. 네가 고쳐준거구나.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레 양손으로 들어, 품에 안았다.
/감히 내 손에서 탈출해.....? 강제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다니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죄물ㅋㅋㅋㅋㅌㅌ물론 순애물과 범죄물은 종이 한장 차이니까 ㅇㅅ<!!1(아님 -
36 이름 없음 (78746E+57) 2016. 3. 24. 오후 1:59:00몽롱한 감각이 전신을 덮쳐오고, 싸늘하던 바닥의 감촉은 사라진 디 오래였다. 있을 리 없는 어머니의 품 속이 떠올랐다. 자신은 기억이 남아있을 적부터 또래의 아이들에게 구두닦이와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그들에게 반납했어야했다. 마음을 나눌 사람조차도 없었다. 빙글빙글 도는 꿈 속의 자신은 소년이 보아도 꽤나 고독해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소년의 표정이 생기가 돌아온 것은. 그녀가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에게 와줬기에. 아직도 그 첫만남을 잊지 못한다. 소매치기를 하다 잡혀 멍투성이가 된 볼썽 사나운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먼저 내게 다가와줬다. 잿빛으로 가득찬 모노크롬의 세계에 그녀를 중심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쩐지, 그녀라면. 그녀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꿈 속의 내용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건 자신의 꿈이 아니다. 의식이 다른 누군가와 작은 실을 통해 이어져있는 감각. 상대방의 꿈 속은 새하얀 마법의 세계였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어른들도 없으며, 밤하늘엔 영롱한 별의 길이 쭉 펼쳐져있었다. 그래, 이건 그녀의 꿈이구나. 소년은 슬며시 꿈 속에서 웃으며 천천히 각성해가는 의식 속에 마지막 꿈을 꾸었다.
—따듯해져가는 날씨, 녹아가는 얼음, 최후엔 그 형체마저 없어져 가서는, 이 세계에, 그리고 소년에게 질려 떠나가는 작은 날갯짓, 오히려 그것이 잘 된 일일지도, 아냐 제발 가지마—그리고 암전.
“…….”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눈을 슬며시 뜨면 이미 해는 지고 농후한 어둠만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소년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커다래진 눈으로 고개만을 돌려 새장을 바라보았다. —없다. 그녀가, 없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로 있는 소년의 눈가에 커다란 줄기의 눈물이 왈칵 솟아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결국 넌 여기에 있어야 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꿀렁꿀렁 흐르는 눈물을 팔로 훔쳐도 멈추지를 않았다. 그래도, 그래도. 그녀와 조금만 더 같이 있고싶었어. 이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일찍 알아채고 가버린 것일까. 한참을 누워있는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리 쪽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곪아있던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도 없었다. 이게 대체……소년은 상체를 일으켜 자신에 다리에 기대어 누워있는 요정의 모습을 발견했다. 환상? 아니면, 꿈의 연장선? 소년은 믿을 수 없단 심정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에게 닿았다. 자고있는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겨주었다. 상처가 나아있았고, 그 주변엔 고운 눈가루가 뿌려져있었다. 네가 고쳐준거구나.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레 양손으로 들어, 품에 안았다.
/감히 내 손에서 탈출해.....? 강제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다니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죄물ㅋㅋㅋㅋㅌㅌ물론 순애물과 범죄물은 종이 한장 차이니까 ㅇㅅ<!!1(아님 -
37 이름 없음 (26942E+53) 2016. 3. 24. 오후 5:17:05>>36
내 시간은 흐르고 너의 시간은 여기 고이는구나.
영원을 약속한 너와 나인데
너는 왜 모랫속에 있으며
나는 왜 이 바다속에 있을까.
영원한건 오직 마음뿐인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육신을 모랫속에 두었지만
나는 너를 이 마음속에 묻어두었지.
흐르는 시간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방법은 없으니
다만 이 마음속에 너를 두어야겟지.
영원한건 오직 같이 나눈 마음뿐이니까.
나는 시간이 흐를동안 널 잊지 못하겟지.
그것은 오랜 옛날의 꿈이였다. 어느 겨울, 얼어붙은 바다 위로 일찍 잠에서 일어난 인어가 혼자서 갈라진 그 틈에 올라와 눈을 맞으며 불러주던 노래였다. 그래.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때 처음 느꼈었기에 작은 요정은 눈물을 흘렸었다. 그때 인어는 이런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었지...
...머리?
따르르...
마치 기지개를 피듯이 날개를 한차례 떨던 소녀는 아직 잠기운에 취해서 하품을 하다가 소년이 눈물을 닦아내는것을 보자 깜짝 놀라서 소년의 얼굴에 다가가 살펴본다.
어디 아파?! 왜그래?! 어?! 라는것 마냥... -
38 이름 없음 (09917E+58) 2016. 3. 24. 오후 11:52:58>>37
“정말……어디로 가버린 줄 알고……내가, 내가 널 가둬서…그치만, 네가 죽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아…….”
전혀 이어지지 않는 말들이 눈물과 함께 바닥으로 흘러떨어진다. 소년은 자신의 감정에, 해야만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헤매고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처럼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자괴감이 시달리고 있었다. 제 얼굴을 걱정스러워하는 얼굴로 요정을 바라보던 소년은 눈물로 얼룩져 흉한 얼굴을 푹 숙여버렸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나가자. 같이.”
울음기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나왔다. 다시 고개를 든 소년의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있었으나, 그 애달파하는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 넌 원래 있어야할 곳으로 돌아가는거야.”
새장에서 나오고, 나한테서도 나와서. -
39 이름 없음 (1933E+46) 2016. 3. 25. 오전 12:27:10>>38
요정은 소년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겟었으나 소년의 닭똥같이 굵은 눈물에 불안한듯 소년의 주위를 날아다녔었다가 소년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머리 위로 내려앉아 조심히 쓰다듬다가 소년이 말을 하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도모르게 균형을 잡지 못 하고 앞으로 떨어져 소년의 품에 착지한 채로 잠시 멍하게 머리를 흔들다가 소년에 말에 한 번, 그리고 울어서 퉁퉁 부워버린 빨간 눈에 다시 한번 놀라 소년의 시선과 맞는 곳 까지 날아가 걱정스럽게 소년의 얼굴을 이곳 저곳 살펴보면서 차가운 손으로 슬쩍슬쩍 만져보다가 말없이 소년의 목에 꼭 매달리듯 껴안습니다.
소년의 결정에 혼란스러워진걸까... 비록 말을 전해주지 못 할진 몰라도 열심히 소란스럽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편이던 그녀는 아주 한동안 소년의 목에 그렇게 매달려있습니다.
//해피엔딩이라면 여기서 겨울마다 다시 만나요 일려나... -
40 이름 없음 (35865E+51) 2016. 3. 25. 오전 12:48:49>>39
소녀는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제 결정을 듣고나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주었다. 이것이 자신과 그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었다. 어째서 이기적인 선택만 거듭해온걸까. 제 목에 매달려있는 요정을 슬픈 눈으로 내려다 본 소년은 그녀를 가볍게 꼭 끌어안았다.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네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어쩌지.”
소년은 일부러 장난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며 히죽 웃어보였다. 이제 슬픈 이야기는 그만. 그녀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후회 없이 그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엔딩 임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새 스레를 만드는 편이 좋을까? -
41 이름 없음 (03034E+48) 2016. 3. 26. 오전 2:44:27>>40
소년의 품에 꼬옥 끌어안겨지자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체온과 소년 특유의 살냄새같은것이 풍겨와서 요정은 저도모르게 그 품에 안기어 고개를 파뭍었다가 소년을 향해 올려다보며 늘 그래왓듯이 빙그레 웃으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니. 너처럼 따뜻하고 착한 아이라면 어른이 되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요정은 자신이 너무 소년을 차갑게 한게 아닐까 걱정될때 아쉬운듯 그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곁에 앉아 지난 겨울, 소년과 보낸 특별한 겨울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땅바닥의 요정가루들을 보며 눈을 빛내었다.
스윽. 슥. 슥.
마치 모래로 그림을 그리듯이 작은 몸을 연신 날개로 움직여가며 그녀는 소년과 소통할만한 수단으로 가벼운 그림을 그리었다. 아. 이런식이라면 너랑 남은 시간을 좀 더 좋게 보낼 수 있겟구나.
//으음 정말 즐겁게 돌려서 결정하기가 더 힘들었었어... 그치만 엔딩이 임박한 기분이라, 이대로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둘이 해피엔딩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
42 이름 없음 (96047E+55) 2016. 3. 26. 오후 12:55:23>>41
그런 걱정 따윈 할 필요 없다는 듯이 마주 안아오는 요정의 모습에 간지럽다는 듯이 작게 웃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움 중에서도, 기분 좋은 차가움. 자신이 일생 느껴왔던 목숨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가혹한 겨울의 추위 같은 것이 아니었다. 좀 더 포근한, 무언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녀의 특별한 고동만이 피부가 닿을 때마다 기억에 남아버리는 것이다. 소년은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 무언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요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엔, 다시 그녀를 만날 기회가 적어져버린다. 걱정이 머릿속을 떠다니는데, 뒤늦게나마 그녀가 바닥에 눈가루로 뭔가를 그리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렇구나. 네 말을 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녀는 줄곧 소통을 해올 방법을 생각했던 것일까. 소년은 내심 감탄하며 눈을 빛냈다. 자신도 손을 뻗어 바닥에 그림을 하나 그려두었다. 서투르고 부끄럽지만, 그녀가 새장에서 나와 날아다니는 모습이다.
“네 친구는 몇 명이나 있어? 고향은 얼마나 멀고? 가는데 지치지 않을까?”
/실은 레스중에 깔아둔 떡밥이 있는게 이걸 발동시킬지 말지 고민중ㅇ이었어.....정말 즐ㄹ거웠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ㅜ나도 앞으로 텀이 길어질지도 몰라!!미리 미안해 o<-<.. -
43 이름 없음 (08955E+52) 2016. 3. 26. 오후 1:11:34>>42
그림을 그린 뒤 자신의 날개와 손의 움직임에 스스로를 뿌듯해하던 그녀는 곧 소년의 감탄과 함께 소년이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그려준 자신을 보고는 굉장히 기쁜듯이 웃었다. 해맑다고 해야할지 긍정적이라고 해야할지... 슬픈일을 금방 털어버리는 성격의 그녀는 곧 소년이 하는 질문에 방긋 웃으며 바닥에 대고 손가락과 날개들을 움직여 대답하였다
딸랑딸랑 따르르릉 따르릉.
질문에 대답하는동안 바삐 움직이는 날개는 투면한 종소리를 그 방안에 채워나갔으며 바닥에는 7명의 요정과 거대한 어느 여성 이라든가 소년이 척 보기에도 얼어붙은것이 가득한 세상이나 날아다니는 소녀들이 그려져있었다.
이걸로 소년과 좀 더 계속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모르게 요정은 기뻐졌다. -
44 이름 없음 (19487E+50) 2016. 3. 29. 오후 9:48:13갱신
-
45 이름 없음 (01559E+59) 2016. 3. 30. 오후 6:07:41주말에 올게, 미안해!!ㅠㅠㅠㅠ
-
46 이름 없음 (58732E+56) 2016. 4. 1. 오후 9:36:35
차가운 눈이 온몸을 스친다. 흐릿한 하늘이 점차 나의 눈에서 멀어져간다. 매서운 바람이 그르렁 거리는 인간이라 할수없는 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녀의 높은 웃음소리는 귀를 찌르고 남은 인간들의 울음소리와 한탄소리만의. 들려온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목소리가 들려온다. 흔들리는 정신을 집중하면서. 그는 총을 으르렁 거리는 좀비들한테 들이 밀었다. 백신은 얼마정도 남은거지 ? 가방속을 이리저리 뒤지던 그는 총알 모양의 백신을 총에 집어넣고서는. 이젠 괴물이 될터인 자의 . 머리를 겨냥했다. 한발의 총성 . 씁쓸한 바람과 혈향이 몸에 닿아 찝찝하게 느껴진다. 괴물이 된 자의 비명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치료는 그들이 알아서 할터. 어짜피 그들은 뇌가 없어도 살수있을터였다.
"....."
[ 이런이런, 그들의 도움어린 손길을 무시하는거야 ? 자기야 ]
"...."
그녀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녀의 체향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정신이없어서. 마치 육체없는 괴물들에게. 마음을 바치라고 명령할것같이 근엄적이게 웃어보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나를 통과한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권총을 들어보인 그는 그녀한테 백신성분이 있는 총을 쏘아내렸다. 그녀는 웃어보이다가. 이윽고 사라졌고. 안개같은 무엇인가가 걷히자. 보이는것은 좀비였던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고통에 젖어있었고. 바람이 찝찝하게 흘러내린다. 모든사람의 시선이 집중된다. 살아있고 숨쉬는 인간들의 눈길이 매섭다. 이윽고 그의 머리속에서는 하나의 조항이 스쳐지나갔고 그는 엉망이된 머리로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더이상 더 나은미래에 필요없는 좀비가 된 어린아이들은 바로 사살할것' 그는 지금 법을 어겼고 그는 지금 범죄자가 되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
47 이름 없음 (32155E+57) 2016. 4. 3. 오후 10:35:45아무도 오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골목길. 그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한 어린 소년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쓰러져있었다. 차가운 골목길의 바닥에는 주인의 손을 떠난 체 쓸쓸하게 떨어져 있는 단검과 소년이 흘린 피만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소년이 살던 마을이 인간과 이 종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았었다. 이 종족의 마법이 집을 불태우고, 인간의 화살이 논 한가운데에 떨어지며, 양 종족 간의 전투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진 그 마을에서 있었던 전투는 인간의 승리로 끝났으나, 소년의 부모님을 포함한 수많은 죄 없는 민간인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소년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의 화살을 이 종족에게 돌렸다. 소년은 이 종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자신을 돌봐왔던 이웃집 노부부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도시에 나가, 자신을 죽인 이 종족과 같은 종족의 수배범을 찾기 위해 공개수배서가 붙어있는 게시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년이 처음으로 목표로 잡은 수배범은 수많은 남성 수배자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여성 수배자였다. 다른 수배자들에 비해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체로, 소년은 그 수배범을 쫓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났을까, 소년은 그 수배범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게 되었다. 소년은 근처에 있는 대장간에서 부모님이 죽은 직후에 받았던 보상금을 탈탈 털어 작은 단검을 산 뒤, 그 수배범이 있는 곳으로 작고 연약한 몸을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소년의 흐릿한 시야 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자신의 목 바로 앞에 겨눠진 칼날과 수배범의 살의가 가득한 눈빛, 그리고 매정한 하늘이 전부였다. 소년은 고통과 공포에 의해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겨우 참아가며, 양 눈에 눈물을 쏟아냈다. -
48 이름 없음 (35925E+57) 2016. 4. 5. 오전 12:38:05갱신
-
49 이름 없음 (68522E+59) 2016. 4. 6. 오후 8:18:42끌올!
-
50 이름 없음 (39669E+60) 2016. 4. 6. 오후 10:39:41햇빛이 유리조각을 흩뿌리듯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교정안
숨을 헐떡이며 그곳을 가로질러 한소년이 같은반의 아이에게 다가간다
"저..저기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
급하게 뛰어온것치고는 소박한 소원
마침 때는 하교시간으로 말을 건 소년도 상대방도 하굣길 아이들사이에 쓸려 시내로 나가기 딱좋은시간
어쩌면 이 기회에 둘은 친해져 다음뻔엔 둘도없는 친구가 될수있고 아님 그이상의 관계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모자랄것 없이 자라온 소년은 모른다
어떤이는 그 카페에 갈 돈이 없을수도 있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갈 시간 조차 없을수 있다는 사실을
/중단문러로 bl nl다 돌릴수있어!
설정은 흙수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금수저의 클리셰
막장추가해도 좋아! -
51 이름 없음 (84731E+53) 2016. 4. 6. 오후 10:45:01>>50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온 소년과는 달리 귀티가 느껴지는 소년은, 자신을 급하게 부르며 제법 소박한 말을 하는 소년을 슬쩍 쳐다봣다. 아. 그러고보니 같은반이였던가. 몇 번 오며가며 얼굴은 본 것 같았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핸드폰의 화면을 슬쩍 보았다. 마침 학원에 갈 때까지는 두어시간정도가 남기야 남았으니 상관은 없었다만.
"좋아."
소년이 필사적으로 물어본것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간편하게 여유를 갖고 느긋히 대답하며 여유로운 생활만 하던 사람 특유의 조금 무료한듯한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
52 이름 없음 (39669E+60) 2016. 4. 6. 오후 10:55:10>>51어 그러니까 일단 내쪽이 금수저로 시작했는데..미안 제대로된 서술을 못해서
-
53 이름 없음 (84731E+53) 2016. 4. 6. 오후 11:33:11>>52 엇 그럼 내가 다시써올게
-
54 이름 없음 (84731E+53) 2016. 4. 6. 오후 11:39:33다시 >>50 에 이어서!
같이 놀지 않겟냐고 다급하게 말하고 나서야 지금껏 지쳐버린 폐가 격렬하게 공기를 들이마쉬기 시작하였다. 바보같이 이럴때 숨이 격렬해져서 헉헉이는 나의 눈에는 나와 너무 다른,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마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고, 분명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도 내 눈이 의심될만큼 멋지게 빼입은 너의 모습이 보이고, 동시에 끔직할만큼 오래된 옷을 걸치고 달리느라고 땀이 조금씩 새어나오는데다가 얼굴도 새빨개진 내가, 추례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는것이 머릿속으로 떠올랐다. 아아아. 이건 부끄러운 짓이잖아. 모처럼 말을 걸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용기를 내서 말걸다니...
아쉬운 마음에 재빨리 달리느라고 엉망이 된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초조한듯이, 부끄러운듯이 네 대답이 나올때까지 흘끗흘끗 너를 바라보았다. -
55 이름 없음 (06663E+61) 2016. 4. 7. 오전 12:03:09"...으응...네가 상관없다면"
살짝 숫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년
말을 걸어준 동급생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못하고 얼굴을 붉힌다
그는 자신을 물주정도로 생각하고 자주 놀러가자는 친구는 많았고 그들의 의도를 알기에 자주 거절해왔지만
이번 제안 만큼은 순순히 승낙한다
그도 그럴게 P는 그를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걸
살짝 멍때릴때또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동급생인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만약 그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해도...상관없었다
상대가 그라면 말이다
"같이 놀러가자"
/이거 금수저가 흙수저를 사랑한다는 설정이라 >>50밑에 적었는데 ..뭐 이것도 상관없나!ㅎㅎ -
56 이름 없음 (88848E+54) 2016. 4. 7. 오전 12:05:18>>54 아아 아까부터 미안해...! 계속 내가 놓쳐읽었네...
-
57 이름 없음 (88848E+54) 2016. 4. 7. 오전 12:12:34"고마워. 아니. 저. 음..."
수락하자 저도모르게 고맙다고 해버려서 멍해졌었다. ...그러고보니 오늘 알바는... 아. 1시간 남았구나. 1시간이나...
라고 할 새에 그가 조금 작은 목소리로 같이 놀러가자라고 하자 끄덕이며 그의 옆에 조금 나란히 서서 최대한 이 기쁨을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막 너무 크게 웃으면 그렇잖아. 막 덜떨어져보일텐데.
"그래. 우리 뭐하고 놀까?"
...놀이터를 생각했다가 머릿속에서 붕붕 지워버렸다. 음.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해. 어쩌지... -
58 이름 없음 (06663E+61) 2016. 4. 7. 오전 12:13:40>>56아냐! 그냥 글이 이어지기만하면 되지 네가 그설정하고싶으면 그대로하면되 자유스레잖아!
-
59 이름 없음 (88848E+54) 2016. 4. 7. 오전 12:23:12>>58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
60 이름 없음 (06663E+61) 2016. 4. 7. 오전 12:44:56".. 글세"
솔직히 애들하고 놀아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카..카페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아무생각없이 던진한마디 사실 예전부터 계획했던곳이다
언젠가 너를 그곳 창가자리에 데리고가 다정하게 이야기 해보는것 그것이 내 소원이 였는걸
"거기 블루베리 케이크가 맛있으니까...아 청포도 타르트도"
케익보단 그곳에 같이 있을 너의 생각에 미소가 지어진다 -
61 이름 없음 (06972E+59) 2016. 4. 7. 오전 12:59:54>>60
솔직히... 나도 어릴때 놀이터에서 놀던 시절-그때는 그나마 집이 평균은 했다. 빚도 적었고...-외에는 거의 돈버느라 바쁜 다른 가족들때문에 집안일만 하다가 요새는 또 알바를 하느라 놀아본 적이 제대로 없었다. 어. 음. 이렇게 샹각하니까 새삼 짠내나네. 나. 그런데 오늘은 그런 우울한거 생각 안 할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너랑 같이 있으니까!
"카페...?"
순간 카페가, 얼마나 비싼 음료들이 많은지를 생각해보았었다. 5000원이 넘어가는 음료라던가 그에 비슷한 케잌... 아. 어쩔 수 없으려나. 너한테는 당연한걸테고.
"엄... 응. 가자."
타르트라든가, 케잌-생일날도 먹기 힘들때가 있는 꿈의 음식이다.-이라던가... 왠지 먼 세상의 디저트를 먹게되는것이 기대된다기보단... 일단 그 가격부터가 보진 않았지만 무서워서 조금 주춤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 왠지 기대하는듯한 저 표정을 보면 말이야... 비록 내 일주일 생활비-대부분 티머니. 나머지 몇 백원은 꼬박꼬박 모아 다음주 생활비에 보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는다.-만큼 나갈 것 같지만... 뭐. 까잇거 학교는 좀 일찍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게다가 정말로 너랑 있는 기회는 드물기도 해서 놓치기 싫구... -
62 이름 없음 (06663E+61) 2016. 4. 7. 오전 1:12:26미안해 일단 나는 먼저 자러갈께 내일 답레 올릴테니까!
-
63 이름 없음 (88848E+54) 2016. 4. 7. 오전 1:15:45응 잘자!
-
64 이름 없음 (78021E+60) 2016. 4. 7. 오후 8:06:26갱신
-
65 이름 없음 (06663E+61) 2016. 4. 7. 오후 8:44:21딸랑-
밝고 귀여운 종소리와 함께 카페로 들어서는 두사람
카페내부는 종소리처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져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오기로 결정하던 순간 그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친것같았지만
....그래도! 이번이니까 조금 욕심부려보기로 한다
너와같이 있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 그렇다면 최대한 너와 하고싶은 일을 후회없이 잔뜩 만들어둘래
"여..여기 블루베리 케익이 맛있으니까...아! 조.좋아하는대로 시켜도 상관없지만
전 아이스티하고 블루베리 케익으로 주..주세요,넌 결정했니?"
P는 그의 맘도모르고 쉴새없이 그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잘거린다 -
66 이름 없음 (88848E+54) 2016. 4. 7. 오후 9:16:38>>65
으어어... 이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뭐지...?
그가 카페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점은 그러하였었다. 아늑해보이는 의자와 카페에 어울려보이는 원목탁자들, 아기자기한 음악에다가 장식물과 단 음식냄새... 거기다가 남자보단 여자들이 많고 커피냄새...는 당연한거구나. 어쨋든간에 그러한 것들과 거의 인연이 없던 N자신은 속으로 카페에 대해서 나름의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멍청한 표정을 짓고싶지 않아서 사알짝 자기 혀를 입속으로 깨물면서 정신을 차린다.
"아. 그러고보니 그랬지. ...난 저녁먹어야되서 간식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음료만 시킬게. 어..."
P가 열심히 설명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 나름 가슴 한구석이 콩닥거렸지만, 그건 얼마안가 N이 가게의 메뉴판을 보는순간 그 콩닥거림이 확 하고 서늘하게 사라져버렸다. 세상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 비싸 음료랑 빵조가리가 왜 만원인데 왜 어째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메뉴판 가장 윗쪽에 작게, 아주 싼 가격이 적힌 음료가 보인다.
[에스프레소---2,500]
저거다. 저거밖엔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안도한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난 에스프레소. 그걸로 주세요."
...저게 엄청 쓰다는건 아직 모르는듯한 N이다. -
67 이름 없음 (79136E+61) 2016. 4. 8. 오전 12:53:09>>66
"아..아! 그렇구나 미안 내가 괜히 참견을
...그럼 아이스티하고 블루베리케이크 한조각, 에스프레소로 부탁드릴께요"
그의 답변에 순간 자신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생각해보는 p
그리고 자연스럽게 n의 계산까지 같이 한다
그렇다고 딱히 n의 집안사정을 생각한건 아니고
이것을 빌미로 다음 약속도 잡아보겠다는 소소한 계획이였다
주문뒤 안락해보이는 천의자에 자리잡은 둘
아직 정면으로 마주본 n의 얼굴은 p에겐 아직 큰 자극이였던 모양인지 언제 입을 달싹거렸냐는듯 발그레 볼을 붉히며 입을 꾹 닫아버린딘 -
68 이름 없음 (9335E+54) 2016. 4. 8. 오전 12:59:45"미안할 것 까지야."
그리고는 더치페이를 하려고 할때 재빨리 자신의 것까지 계산해버리는 P를 보고 N은 속으로 살짝 놀랐다. 마...만원이 넘어가는건데 그걸 한방에?! 우와... 역시 P는 대단하구나. 난 절대 쉽지 않을 일을... 이라고 생각하며 진동벨을 받고 안락한 의자에 P의 가방까지 맡아 자기 가방이랑 옆에 두고는 P를 마주보고 앉아 의자에 기댄다.
"푹신푹신하다..."
그러던중에 P의 빨개진 얼굴을 보고는 괜히 자기가 촌티내서 부끄러운건가 하고 속으로 띄악하다가 정신부터 차린다. 에이. 아니지. 아닐거야. P는... 매일 봐왓지만 그렇게까지 나쁜앤 아닌걸. 이거갖고 그러... 아니지? 아닐거라고! ...라고 생각하는 중에 벨이 울리자 일단 N은 일어선다.
"내가 갖고올게."
...그 후 N이 돌아오자, 그가 갖고온 쟁반에 설탕봉투가 가득 있었다.
"...점원누나가 이상하도록 많이 챙겨줫어." -
69 이름 없음 (63172E+56) 2016. 4. 9. 오후 7:16:34넓게 펼쳐진 크로크 판에 압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다채로운 종이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바람에 조금씩 펄럭이는 종이의 아랫부분에 압정을 찔러 넣어주는 상냥함은 덤. 내용을 읽는 것은 가볍게 생략한다. 어차피 전부 동아리 홍보인 건 뻔자지만.
어떤 동아리에 들 것이냐는 네 말에 자연스럽게 너 하는 거,라며 내뱉으려던 입이 다물어진다. 그래, 뻔한 것은 저 종이들뿐만이 아니었지.
"학교의 범생이는 좋겠네. 회장하세요, 학생회 하세요, 영입도 들어오고. 바빠서 내 얼굴은 어떻게 보시려나?"
조금 퉁명스럽게 나간 말이지만, 절대 질투 같은 오글거리는 이유가 아니다. 4학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항상 그랬었다. 너와 함께 복도를 거닐면 너의 모범력이 어느새 학교 전체에 전해진 것인지 넘쳐나는 심부름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네 이름, 네 이름, 네 이름.
오늘도 변함없이 담임 선생님의 심부름 원정을 떠난 너와 급식을 거른 나. 물론 다른 아이들과 함께여도 됐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조금의 자기합리화를 덧붙였다. 아무튼 이게 다 네 탓이야. 이런 명목하에 기껏 뜯어낸 빵을 신경질적으로 우물거린다.
"넌 또 학생회일 것 같고. 대충 적당히 남은 거 해야지, 재미도 없는 동아리."
가방 속 구겨진 숙제와 모서리가 찢긴 학습지 뭉텅이 중 어딘가에 자리 잡았을 별거 없는 동의서가 떠오른다. 이미 제출 기한은 넘은지 오래지만, 가져가는 걸 포기하면 귀가 잡힘과 동시에 나무 자가 강림하겠지. 그깟 종이 쪼가리가 내 고통과 등가교환이라니, 불합리한 세계.
"덧붙이는데, 안 삐졌어. 전혀."
메롱. 들리지 않을 음량으로 네게 입모양을 찬찬히 보여준 뒤 손에 들린 탄산음료를 원샷 한 후 앞서 걸어나간다. 짜증 나게 따뜻한 공기. 이대로라면 수증기가 되어버릴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성별도 상황도 시간도 길이도 뭐든 좋아! -
70 이름 없음 (16482E+54) 2016. 4. 9. 오후 7:21:34>>69 앗 내가 한번 이어보고 싶은데 속도가 느려서 미리 알리구 쓰러 다녀올게 :)
-
71 이름 없음 (58046E+57) 2016. 4. 9. 오후 7:23:34>>70 묻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ㅠㅠ 고마워!
-
72 이름 없음 (16482E+54) 2016. 4. 9. 오후 7:44:17>>69
어떤 동아리에 들 것이냐는 제 말에 부루퉁한 말이 제게 찾아왔다. 네 옆모습으로 시선을 올리며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는 대신 부드럽게 소리 죽여 웃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이지, 뭘."
옅은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로 변명하듯 내뱉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부탁을 거절하는 성격도 못 되는 뿐더러, 잘 보여서 나쁘지 않을 거라는 가치관─예외도 있지만─, …뭐어, 오지랖 탓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법 하지만.
너와는 그렇게 가까우면서, 너와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잦았다. 덕분에 문득 뒤를 돌아보면 너를 은연 중에 부러워하고 있음을 늘 자각하고는 했다. 왜일까. 모르겠어. 나 없어도 잘 지내고, 자유롭고. 이런 말을 하면 한 대 맞거나 욕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지만. 결국 네 말에 난처함이 섞인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경질적으로 빵을 먹으며 먼저 걸음을 옮기는 네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메롱? 하하, 아구구, 알았어 알았어. 여러 동아리 홍보가 매달려있는 크로크 판에서 흥미를 잃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듯 몸을 움직여 너를 쫓아 네 몸에 매달리듯 옆에서 얼쑤 껴안으며 눈사위를 휜다. 남자끼리 무슨 포옹이냐 해도 평소의 제 성격을 알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 말까? 너랑 같은 동아리 할까?"
나도 마음만 먹으면 거절 정도는 할 수 있어. 마치 연극의 한 편을 보듯, 비장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덧붙인 뒤, 다시금 부드럽게 숨죽여 웃는다.
-
73 이름 없음 (58046E+57) 2016. 4. 9. 오후 8:20:51>>72
"그 오지랖, 나한테 다 넘기면 되지. 아침마다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머리 감겨주고. 아, 크면 로봇 하나만 만들어줘. 그럼 되겠네."
나른한 몸 상태와 겹쳐 생각만해도 마음이 3할쯤 편안해진다. 학교를 대신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단연 최고겠지만 말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싶다. 어렸을 적 한 번쯤 해봤을 순간이동이라던지 염력 같은 상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하루하루를 현대 과학에게 실망하는 일상이다. 귀찮음 족은 이 세상 어디로 가서 살으라는 건지.
"더워, 저리 떨어져. 한 6억 광년 쯤."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빠져나가려 노력한다. 제딴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 해도, 당하는 본인은 닿는 면적마다 나노단위로 소름이 올라오는 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미 뇌내에선 거미줄에서 벗어나려하는 잠자리의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이대로 뜯어 먹힐 수는 없지.
"바보 같은 소리하네. 자기 발로 걸어들어온 내신을 왜 걷어 차?"
내 인권보다 높은 것 목록 구석에 들어있는 내신이다. 중2병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그깟 숫자 모으는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다들 난리인지. 하고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만사가 귀찮은 학생에겐 이 세계가 부적합할 뿐이다. 언젠가 하고싶은 게 있을 때 기회도 오겠지라며 하루하루 미루고있지만.
고리타분한 생각이 머리를 채우니 절로 따분해져 하품이 새어나온다. 걷고 있으니 폼은 이상하겠지만 네게 머리를 살짝 기대어 눈을 감는다. 넘어질까봐 살짝씩 실눈을 뜨긴 했지만 말이다. 집에 가면 바로 자야지, 그렇게 다짐함과 동시에 또 한 번 작게 하품이 나온다. -
74 이름 없음 (16482E+54) 2016. 4. 9. 오후 8:41:29>>73
"아하하, 그건 완전 보모 아니야?"
그럼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오, 괜찮은데. 궁상맞은 상상을 하자니 또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괜찮긴 한데 좀 웃기다. 세상의 모든 귀찮음을 짋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있는 도련님 옷 입혀주고, 밥 해주고, 씻겨주고. ……윽, 제대로 상상하니까 더 웃겨.
"에이, 나 같은 친구가 또 어딨다구."
손등으로 입을 가려 웃음을 참아내며 괜히 딴 소리를 한다. 어쩌면 나 역시 너 만큼이나 좋아하는 것도, 관심있는 것도 없을지 몰라. 내가 뭘 해야하는지. 그냥 세상의 흐름에 장단 맞춰주는 것 뿐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덜 시끄럽고, 덜 소란스럽고, 덜 귀찮아지고.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사사로운 것들을 떠앉는 포지션이 되고 말았지만, 딱히 거기에 어울려주지 못할 건 없던 탓이다. 네가 불편한 자세로 머리를 기대며 하품을 내뱉을 때도, 한참을 말 없이 묘한 미소로 정면을 바라보다 네 등을 가벼이 도닥여주며 애매하게 웃었다. ──그야…,
"그야,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내신 채우다 그런 것들 놓치면 어떡해."
우리 친구야도 나 없으면 재미없잖아, 흐흥.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목소리로 웃음기를 섞었다. 졸려? 자장 자장~ -
75 이름 없음 (63172E+56) 2016. 4. 9. 오후 9:14:13>>75
"보모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간단하게 노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넌 무조건 내 하인이야."
노예가 생기면 뭘 시키는게 좋을까. 대리로 맞아주고, 숙제도 시키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커서 은둔 생활을 하기에 딱 적합하기에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환상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비인륜적인 신분제도지만, 상대의 봉사정신만 있다면 상관 없잖아.
"네네, 참 좋은 친구십니다. 제 곁에 있어주셔서 황송하죠."
너와 내가 이웃에 산다는 이유로 짝꿍을, 친구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주변에서 하루라도 이상한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사실 나도 이런 모범생이 왜 나와 함께하는 것인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동아리, 뭐 하고 싶은데."
흘깃 보고 들었던 부들의 목록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내여본다. 영화감상부, 작년에 했고. 영어 말하기부는 머리 아프니 탈락. 사실 어찌됐던 상관은 없지만, 너는 상관 있지 않을까. 몇 년을 함께했는데도 표정 뒤에 숨겨있는 게 무엇인지 가끔은 알 수 없어 아리송 한 사람이다, 너는. 네가 재밌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만. 혹여나 가면이 아닐까 네 얼굴 표면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본다. 역시 안 나오네.
"그럼 노예는 지금 당장 아이스크림을 사오도록, 실시."
가까이에 길목의 편의점이 나오자 천원을 꼭 손에 쥐어주고 너를 부려먹으려 시도한다. 이걸 셔틀이라고 하던가. -
76 이름 없음 (02238E+59) 2016. 4. 10. 오후 4:59:07이름 없는 숲 속 깊은 곳에, 버림받은 소년이 홀로 떠돌아다니고 있어. 마을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힘도 약하고, 마법도 잘 못 쓰고, 몇몇 특별한 아이들처럼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소년은 마을의 광기 어린 사상에 의해 친구, 선생님,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버림받고는 마을 밖으로 내쫓겼어.
그 외로운 소년은 자신이 떠돌아다니는 숲 속에서 내려져오는 소문을 쫓고자 했어. 이 숲 속에 드래곤의 은신처가 있다는 소문을. 소년은 그 드래곤을 찾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려 해.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비난받는 자신을. 나를, 죽여달라고.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서서히 저 너머에 있는 산 아래로 사라져갈 즈음, 소년은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어. 그 동굴 주변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소름이 돋으려 해. 이 동굴 너머에는 커다란 드래곤이 살고 있을 것 같아.
소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이끌려가는 듯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위가 어두워지고, 이상한 기운 때문에 당장이라도 동굴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계속 걸어갔어.
소년은 드래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지 고민했어. 그냥 만나자마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지, 드래곤을 도발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이게 할지. 소년은 계속 고민했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은 없던 소년은 동굴의 끝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
// 버림받아서 상처받은 소년이랑 드래곤이랑 NL로 해서 한 번 돌려보고 싶다! 좀... 많이... 특이한 취향이기는 하지만... :3c -
77 이름 없음 (81636E+55) 2016. 4. 10. 오후 5:06:02>>76 오. 내가 물어볼게. 잠깐맘
-
78 이름 없음 (81636E+55) 2016. 4. 10. 오후 5:38:51>>76
오랫동안 동굴속에 살던 드래곤은 너무나도 심심하고 외로웠어. 1000년 전까지는 특이한 드워프랑 앨프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들러서 며칠씩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지만 그건 너무 옛날일이였거든. 그것보다 조금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는 그나마 자기를 죽이려 오러 오는게 섬뜩하기는 해도 인간들이나 악마들이 자주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어. 나름 싸우는것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용은 즐겁게 목숨을 걸고 놀아줫었는데 그마저도 몇백년씩 지나니까 점점 발길들이 끊기고 동굴 밖까지 나가도 숲에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용은 너무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진거야. 하지만 용은 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안돼. 정말로 나가려고 할 때도 동굴 주변만 잠깐 나가야 돼. 용이 태어나기 이잔부터 있던 마왕을 용이 태어날 때부터 봉인해버려서 용은 그걸 지켜야만 했거든.
그런데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싶을때 용의 예민한 귀에 발소리가 들리는거야. 작고. 힘없는... 단 한명의 인간이 내는 발소리가 말이야. 용은 무척 기뻣어. 언젯적인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간만에 심심하지 않게 할 상대가 온거니까. 그게 너무 기뻣어. 그래서 용은 소년이 발을 멈췃을때 기쁜 맘에 두근거리느라 소년이 자신에게 오는 때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서 몇발자국 앞서 걸어가 소년에게 다가왓어. 소년을 보니까 용은 너무 기뻐서 목을 쳐들고 동굴 안이 떠나가라 크게 울부짖었어!
...그리고 용은 모르겟지만 그런건 흔히 인간들이 스피어라고 부르는,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공격기중에 하나였어. -
79 이름 없음 (02238E+59) 2016. 4. 10. 오후 6:03:18>>78
소문대로, 동굴의 끝에는 드래곤이 살고 있었어. 소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드래곤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그 크고 위험한 드래곤을 눈앞에서 마주했으니까. 그 드래곤이 목을 치켜세우며 크게 울부짖자, 소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있었어.
소년은 자신을 죽여줄 드래곤을 찾았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드래곤의 모습을 보고 그만 겁에 질려버리는 바람에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되었어. 슬픔이 담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자, 소년은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드래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저, 저... 드래곤... 맞죠?"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무서운 드래곤의 모습에, 소년은 드래곤을 도발하여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어. 소년은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봤자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기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드래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로 했어.
떨어지려 하지 않는 그 작은 입을 겨우 때며, 소년은 우는 목소리로 드래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어. 자신이 하는 말이, 이번 생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보다 겁이 많던 소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는 순간이었어.
"그렇다면, 절... 죽, 죽여... 주세요. 부탁, 할게요..."
말을 마친 뒤, 소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 끅끅거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 이어줘서 고마워! :D 좀 많이 특이한 스타일이라서 아무도 이어주지 않으려 했을 것 같았거든. -
80 이름 없음 (16614E+54) 2016. 4. 10. 오후 10:08:43갱신!
-
81 이름 없음 (33388E+56) 2016. 4. 11. 오전 6:32:47오늘도 갱신. >>78, 혹시 많이 바쁜거야? :0c
-
82 이름 없음 (85847E+56) 2016. 4. 11. 오전 8:10:53>>81 미안... 답례쓰고나서 갑자기 기절해버렸어. 그러다가 방금 일어났지 뭐야... 엄청 자버렸네. 지금 이을게
-
83 이름 없음 (43328E+52) 2016. 4. 11. 오전 8:14:43>>82 아, 그랬구나. 괜찮아. :D 피곤하면 기절할 수도 있는거지.
-
84 이름 없음 (52222E+57) 2016. 4. 11. 오전 8:40:50>>79
용은 너무너무 기대되었어. 소년의 행색이 옛날에 자기를 찾으러 왓던 어떤 용사와 너무 닮아있었거든. ...검이 없단거랑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라 겁에 질려서 우는 표정만 뺀다면 말이야. 아아. 그러고보니 그 용사 참 잘싸웟는데 말이야. 그 용사가 오기 전까지는 마왕을 부활시키려고 왓던 4천왕중 한명인 디아블로라는 악마가-그녀석은 살려두면 안되겟다 싶어서 이기자마자 꿀꺽 삼켜서 아드득 빠드득 씹어먹어버렸지. 강해서 그런가 진짜 맛있었는데.-가장 강하게 느껴졌는데 나는 그 악마가 온뒤로 더 강해졌었거든? 그런데 그 용사랑은 20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싸웟는데 결판이 안난거야! 그게 너무 대단스러워서 내 심장을 뽑아가지 못해 아까워하던 용사에게 대신이라지만 뿔 하나를 잘라줫었는데... 아무튼 저 소년도 분명 용사이고, 아마 그만큼 강하다면 간만에 반가운 싸움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해서 나는 소년이 말을 할때도 흥분되고 기뻤어.
[그래! 네가 보는대로 나는 드래곤이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황혼의 마왕 라그나로크의 봉인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새벽까지 막아버린 그늘이라는 예언의 주인이 바로 이몸이지! 크캬캬캬! 이번에는 네가 이몸에게 도전하려고 온 것이느냐? 인간아!]
그런데 당장에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자기의 이름을 말하며 달려들중 알았던 소년이 갑자기 겁에 질리다가 하는 말을 듣자 드래곤은 놀란 동시에 어이없었어. 그리고 소년이 울자 당황해버렸어.
[으잉? 갑자기? 왜? ...잠깐만 울지 좀 말고 말해봐!]
아니 몇백년만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용은 소년의 사정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자레를 낮추고 머리를 소년 가까이로 쑤욱 들이밀면서 소년을 바라봣어 -
85 이름 없음 (82682E+49) 2016. 4. 11. 오전 9:06:39>>84 를 이은 레더주인데, 일이 있어서 4~5시 사이에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어
-
86 이름 없음 (82682E+49) 2016. 4. 11. 오전 9:07:25억 링크 잘못걸었네
-
87 이름 없음 (96073E+56) 2016. 4. 11. 오전 11:45:48>>84
소년은 드래곤 특유의 위용과 드래곤이 하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 마왕의 봉인을 지키고 있고, 대대로 내려져오는 예언의 주인공을 눈앞에서 마주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을 거야.
자신을 죽여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듣고 드래곤이 소년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자, 소년은 드래곤의 두 눈을 바라보며 뽀얀 얼굴을 가로지르는 눈물을 닦으며 드래곤의 질문에 울음을 참아가며 대답했어.
"저, 그... 전, 살아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으... 니까요."
가슴을 억지로 쥐어짜며 질문에 대답한 소년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공포와 서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부모에게까지 버려진 소년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했어.
소년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신의 양손으로 닦다가, 이내 붕대가 감아져 있는 작고 힘없는 손목으로 닦아내렸어. 그리고, 소년은 마지막으로 드래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 눈물로 얼룩진 목소리로, 소년은 드래곤에게 다시 한 번 말했어.
"그... 러니, 죽여... 주세요."
소년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아가며, 서러움이 담긴 두 눈으로 드래곤의 눈을 바라보았어.
// 맞다, 혹시나 해서 적어보는데 난 9시 쯤이 되어야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 그러니 천천히 이어 줘! -
88 이름 없음 (43882E+52) 2016. 4. 11. 오후 5:59:47>>87
기껏 몇 백년만에, 사람이 왓는데, '그냥' 죽여달래. 드래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쩔줄 몰랐어. 그래서 그냥 뽀얀 볼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년을 바라보다가 그 소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속 울다가 다시 즉여달라고 소년이 말할때 까지 다시 그냥 소년을 바라봣어.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 당연하지. 드래곤으로서만 살아왓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계속 이 인간이 우는걸 보는건 따분하기도 하고 간만의 사람인데 그냥 죽으면 아깝기도 하고...
[어... 음. 못할 것은 없지만 지금은 안돼. 난 아직 배가 부르거든. 몇 시간만 기다려.]
뭐 이 덩치에는 당연히 언제든지간에 소년을 아그작빠드득 씹어먹을수야 있는 드래곤이라서 별로 저 말이 신빈성이 없다는건 드래곤 본인도 잘 알고있대. 그래서 드래곤은 생각하다가 말했어.
[근데 그 붕대는 뭐냐? 내가 알기로 그런건 아픈 놈만 한다고 들었는데. 설마 병이 있다거나 하는건 아니겟지? 난 건강한걸 먹고싶다고.] -
89 이름 없음 (02709E+59) 2016. 4. 11. 오후 9:31:03'오늘은 운이 좋아'
그녀는 보들거리는 비단 기모노에 얼굴을 부비며 생각했다
그도그럴게 오늘의 먹이는 부잣집 도련님이 였으니까
먹이가 부자라면 부수적으로 얻을것들이 많아지니까 좋다
이렇게 좋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가지들,서양에서 들여온 신기한 장난감,그외의 반짝거리는 소지품들
"쿄쿄쿄.. ."
남자가 가지고있던 만회경을 가지고 놀며 기분나쁘게 키득거리는 그녀는 이근방 환락가를 앞마당으로 삼아 남자를 꾀어내 잡아먹는 요괴
물론 이름은 없다
요괴에게 이름이란건 누군가에게 계약당했다는 뜻이니까
이리저리 자유로이 놀러다니는 그녀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
'오늘사냥도 끝났으니 이제 이리녀석하고 놀까 아님 천호? 아! 오니도 있었지'
손바닥보다 뒤집어지기 쉬운 그녀의 흥미는 만회경도 지겨워졌는지 다음 놀거리를 찾으러 남자의 시체를 뒤로한채 골목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냥 요괴가 놀러다니는 이야기! 아 퇴마사하고 시비붙는것도 재밌을지도... -
90 ◆Q6S15l307g (42901E+54) 2016. 4. 11. 오후 9:43:46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 끝없이 까맣고 어두운 밤의 성은 적막하고 쓸쓸했다. 하루종일 관속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산속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것도.. 이제 재밌지 않아. 그렇다고 밖을 나서면 그 몇리동안이나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 불평하면 프레디는 숙녀에게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는것이 교양을 쌓는것의 일부라 하겠지..., 내가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
겉보기와 다르게 살벌한 생각을 하는 소녀는, 이내 천진하게 웃고 아무생각도 안했다는듯 가볍게 떨쳐냈다. 그러나 새로운 무언갈 갈구하는 그 감정만은 마음속에 조그만 돌멩이가 걸린것 처럼 세레나의 가슴 속을 자극하는 느낌이였다.
그대로 날개를 펼쳤다, 제 몸의 두배만한 검은 날개가 펄럭이며 펼쳐지고 소녀는 그대로 창문을 열어 떨어지듯 낙하해 비상하듯 하늘로 날아올라 어딘가로 하염없이 비행했다.
'밖은 위험해요, 뱀파이어의 힘은 강하지만 그렇기에 사람들은 떼를 지어 우리를 사냥합니다.','사람은 흡혈귀를 증오하며 저주합니다','그들은 우리에게..' ...세레나의 머릿속이 아파왔다.
" ..난 아니야 "
그렇게 어디까지 왔을까, 소녀는 생명체의 손길이 닿은듯한 정원의 위에 날개짓 하고 있었다. 날개를 접고 정원으로 내려와 넓어보이는 벤치에 웅크려 앉았다. 이곳엔 사람이 있을까..? 늦은 밤이니 모두 다 잠들어 있겠지..사람들은 날 보면 죽일까..?
..까만 밤, 이름모를 정원에 앉은 소녀의 옆엔 나뭇잎 스치는 소리들이 밤바람에 스선하게 연주되고 있었다 -
91 이름 없음 (85598E+59) 2016. 4. 11. 오후 10:12:29>>88
소년은 서러워했어. 자신을 죽여줄 드래곤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자신의 과거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야. 처음으로 세상 밖을 보게 된 날,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을을 돌아다니던 날,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날. 그리고... 소년을 이곳으로 오게 한 끔찍한 기억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어.
그 끔찍한 기억들이 회상된 탓일까, 소년은 마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아이', '무식하고 멍청한 꼬맹이', '자신의 아이인 것이 부끄러운 꼬마'. 그런 말들이 소년의 귀에 속삭이듯 들려오기 시작했어.
드래곤은 소년의 죽여달라는 부탁에 지금 당장은 안되고, 몇 시간만 기다리라고 했어. 소년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흘러내리려 하는 눈물을 억지로 참기 위해 표정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소년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했어. 드디어 고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드래곤이 소년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보고 혹시 병을 앓고 있냐는 이야기를 하자, 소녀는 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에 부정했어. 소년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허약하고 잔병을 많이 앓곤 했지만, 지금 당장은 병을 앓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은 붕대를 감은 손목을 등 뒤로 가리려고 했어. 마치 붕대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소년은 고개를 숙이다가, 여전히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드래곤에게 말을 걸었어.
"저, 드래곤... 님. ... 언제, 절... 죽여주실 건가요?"
몇 초라도 빨리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듯, 소년은 드래곤에게 언제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았어. 이번에는 소년이 드래곤의 두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며 드래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 -
92 이름 없음 (30641E+63) 2016. 4. 11. 오후 10:23:39>>90
한 남자가 있었어.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까지 모두 은백색으로 물든 남자가. 남자는 태어나서부터 햇빛을 받을 수 없었어.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라고들 하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태양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어. 태양빛을 받으면 피부가 발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웠거든. 그래. 남자는 사람들이 알비노라고 부르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남자는 태어난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지. 가끔씩은 정신을 잃기도 했고, 그것보다 조금 자주 피를 토하기도 했어. 늘 현기증에 시달렸고 찬바람이라도 심하게 쐬는 날에는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
하지만 남자는 늘 밖을 그리워했어. 햇빛을 받을 수 없는 남자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답답했거든. 숨통을 턱 막는 느낌이었어. 그럴때마다 할 수 있는건 제 육체에 대한 아쉬움이었지.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한탄하거나 하진 않았어. 남자는 잘 알고 있었거든. 자신이 이렇게 본가에서 떨어져나와 별장에서 은둔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는 것도 부모의 덕택이라는걸. 남자가 할 수 있는건 가능한 많은 책을 읽어 남자의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뿐이었어.
그날 밤도 남자는 기침을 하다가 잠을 날려보냈어. 창문이 열려있었던 탓이야. 남자는 기왕 이렇게 된거 정원으로 나갈 채비를 했어. 남자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해가 뜨지 않은 밤 뿐이었고, 오늘 밤은 잠도 더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 남자는 조금 두꺼운 실외복, 그러니까 가운에 몸을 꿰어넣고 밖으로 향했어. 조금 긴 복도를 지나 정원을 맞이했을때, 남자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어. 정원을 가득 채운 달맞이꽃이 소담하게 피어나있는 까닭이었지.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남자는 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어. 남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올리 없는 이 정원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야. 남자는 연못 근처의 벤치에 다다라서야 입을 열었어.
" 혹, 누군가에게 볼일이 있으신겁니까? " -
93 이름 없음 (43882E+52) 2016. 4. 11. 오후 10:37:31>>91
어 내가 왜 이러는걸까 저 소년은 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서 우는걸까 등등...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드래곤은 소년의 비참한 심정보다는 자기 안의 호기심이랑 답답함때문에 소년을 어찌할 수 없었어. 보통 죽는건 아프다고 하는건데, 아픈건 누구나 싫어하는건데, 왜 소년은 죽으려고 하는걸까... 이해할 수 없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어. 병이 없다는 소리를 듣자 일단 안심되긴 했어. 근데... 숨기는게... 어... 상당히...
[좀 보여줘봐.]
톡톡. 어느새 꼬리를 써서 드래곤은 소년의 다리를 뒤에서부터 치면서 바짝바짝 다가가다가 깜작놀랐어.
[어. 으응... 아직 배 안고픈데.]
그러다가 왠지 두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소년의 앞에 업드렸어. 뭐 이건 거의 엘프랑 드워프 부부들이랑이나 있을때 했던 편한 자세지만... 그래봣자 이 인간은 그정도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 니 신세가 맘에 안들어서 죽으려고 하는거라면... 그거 바꿀 수 있다면 안 죽을꺼야?] -
94 이름 없음 (85598E+59) 2016. 4. 11. 오후 10:59:06>>93
소년의 손목에 감긴 붕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소년 자신밖에 알 수 없을 거야. 이 붕대는 소년이 직접 감은 거니까. 자신의 손목에 남은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이 붕대를 사용한 것이니까. 소년은 그 붕대가 감춘 상처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어.
드래곤이 꼬리로 손목을 몇 번 톡톡 치자, 소년은 자신의 손목을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는 듯 마치 손목이 로프에 의해 묶인 것처럼 팔을 움츠리며 양 손목을 서로 맞대었어.
드래곤의 소년의 말을 듣고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자, 소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체로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은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소년과 드래곤의 숨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주변이 고요해지자, 소년은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었어.
드래곤이 소년에게 자신의 신세를 바꿀 수 있다면 죽지 않을 것이냐고 하자, 소년은 고개를 살짝 들고 드래곤의 두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에 부정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소년은 죽으려고 할 거야.
여기서 드래곤이 마법을 써서 마을 주민들과 자신의 부모님이 다시 소년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소년은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다른 마을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허약한 소년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야. 극심한 서러움과 공포 때문일까, 소년의 머릿속엔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의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순 없었어.
"...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거예요. ... 사람들은, 절... 받아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
95 이름 없음 (43882E+52) 2016. 4. 11. 오후 11:22:50>>94
[왜에에에 보이면 죽어? 죽는거야아아?]
슬슬 지루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로 그냥 먹어버릴까 고민하던 드래곤은 그래도 저 울음소리는 그만 듣고싶은 것인지 머리를 몇 번 흔들다가 소년의 말에 기가찬다고 생각했어. 왜냐고? 드래곤은 생물에게 쓸모있다든가 쓸모없다든가 하는 가치를 붙인다는 명제가 붙는 상황도 처음이였고. 이렇게 한결같이 죽으려는 인간도 처음이라서 말이야. ...그냥 진짜로 먹어버려? 까잇거...
라고 생각하며 입과 그 안의 뾰족한 이빨로 감춘 혀를 살짝 내밀고 날름거리다가 소년의 얼굴이 진짜... 말 그대로 죽상이 되는걸 보자 푸우 하고, 소년의 머리카락이 파르르르르르 날릴만큼 한숨을 내쉬다가 말하였다.
[나도 그냥 해본 말이긴 하지만 뭐... 엄. 그 사람들만 사람인거야? ...참나. 인간세상은 그새 왜이렇게 이상해진건데? 이해를 전혀 못하겟어. 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서있으면 지루하지 않아? 막 엄청 울면 머리는 안아파?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
...드래곤은... 지능이 나쁜게 아니라... 그냥... 기억도 거의 안나는 어릴때부터... 이 동굴에서만 사느라... 좀... 세상을 모를 뿐이야. -
96 이름 없음 (85598E+59) 2016. 4. 11. 오후 11:44:15>>95
소년이 필사적으로 손목을 숨기려 하자, 드래곤은 소년에게 보이면 죽는 것이냐고 말하였어. 소년은 그 말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정했어. 붕대 너머의 상처가 보인다고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년은 그 상처를 보여주긴 싫었어. 괜히 그 상처를 보였다가는... 손목에 나 있는 그 흉터를 보였다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공포에 서서히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걸까.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 드래곤이 소년을 향해 한숨을 쉬자, 소년은 고개를 완전히 들어 눈물에 의해 주변이 빨게진 두 눈으로 드래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어.
서서히 진정이 되어가는 것인지, 소년의 훌쩍임도 많이 줄어든 듯했어. 드래곤은 소년의 행동과 사람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는 소년에게 질문했어. 소년은 잠시 심호흡을 하며, 다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드래곤의 질문에 대답했어.
"... 모르겠어요."
비록 진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울음기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소년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내고도 몇 번 훌쩍였어. 소년은 드래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 이렇게 서 있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았고, 어떻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왜 인간들의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도 소년은 알 수 없었어. 왜 자신이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것인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됐는지. 이유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
소년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한줄기의 눈물을 닦기 위해 뒷짐을 지던 손을 얼굴 근처에 갖다 댔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소년이 그렇게 숨기려 하던 손목을 감은 붕대 아래에 자그마한 흉터 한줄기가 살짝 보이게 됐어.
// 졸리다... 이제 슬슬 기절할게.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다면 1:1 보트로 갈 생각도 한 번 해 보자! :3 -
97 이름 없음 (70747E+65) 2016. 4. 12. 오전 12:04:59>>89로 갱신!
-
98 이름 없음 (08767E+65) 2016. 4. 12. 오전 12:14:57항구 근처에 어지러이 늘어져있는 방파제
사뿐사뿐, 때로는 위태롭게 그 위를 거닐던 그녀는 조금만 발을 내뻗어도 바닷속으로 잠겨들만한 곳에서 멈추어섰다.
이곳으로 오기 전만 해도 차분하게 빗었던 검은 머리카락이 이젠 소금기 가득 머금은 바닷바람에 엉겨붙은게, 꼭 서로 자리를 잘못잡아 이도저도 아니게 자라버린 돌미역과도 같았다.
'생각해보면 당신을 만난 때도... 이곳, 이날, 이시간이었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빠져버릴것 마냥 몸을 기울여 수면에 비추어진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때와 달라진게 있다면 이젠 소녀라고 부를 수 없을만큼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
거기까지 생각했을 무렵 찌릿, 하고 아파오는 가슴에 붉게 뜬 세손가락 남은 손을 얹어보았다.
'난 지금 왜 여기 있을까,' 괜시리 울컥하는 마음이 치솟아 돌무더기에서 발을 떼버리고 싶었지만, 죽고 싶은 욕구만큼 살고 싶다는 본능도 컸기에 그녀는 애꿎은 방파제를 지긋이 힘주어 누르는 것으로 겨우 화를 가라앉혔다.
"거짓말이었을까...? 우리 둘 중 누군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걸까...?"
하늘을 올려다 보며 혼자서 되뇌이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을 독백...
편집장에게 매번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는 독백이란 것을 참으로 좋아했었다. 아마 계기가 된 특유의 문체가 아니었다면 그런 잔소리를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들었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헤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걸지도 몰라..."
끝에서 끝까지 난잡하게 늘어선 삼각 돌무더기들을 하나하나 밟으며, 그녀는 자신 나름대로의 밤바다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
99 이름 없음 (24219E+64) 2016. 4. 12. 오전 1:30:10>>98지금 이어도 될까?
-
100 ◆Q6S15l307g (04494E+57) 2016. 4. 12. 오전 1:40:22>>92
" ...! "
소녀의 동물적 감각은 곧바로 인간의 냄새에 경계 태세를 갖추라고 부추기었다,그렇지만 이내 파리한 그 모습에 '피를 흡혈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사라져 버렸다. 저런 사람의 피라면 마셔도 맛있지 않아.
소녀는 남자의 말을 들은체만체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하는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약해보이는 저 남성을...
그대로 벤치에 누워 푸른 달빛에 시선을 옮겼다, 달빛이 소녀의 전신을 비추고 살결이 빛나는듯 아름다웠다.
" ..... .. ...... .. "
갑자기 눈을 뜬 소녀는 거대한 날개를 펼쳐, 순식간에 남자를 덮쳤다. 남자의 팔을 강한힘으로 포박한채 그를 땅에 쓰러트려 위에 올랐다. 모든건 순식간. 평범한 인간들은 경악할만한 힘과 속도.
세레나는 칼날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트린 남자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는 속삭이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은..? "
남자의 팔을 포박하던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
101 이름 없음 (28372E+67) 2016. 4. 12. 오전 1:46:55>>99
늦은 밤인데도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구나! 반응 고마워. :)
지금 이어주어도 문제는 없지만, 아마도 내가 곧 잠들것 같아서... 그점은 미안해... ;(
그래도 저녁시간즈음에 돌아올 수는 있어! -
102 이름 없음 (70747E+65) 2016. 4. 12. 오전 2:17:05찰방
가볍게 바닷물을 치는 소리와 함께 물속에서 달빛을 담은 비늘들이 그 형체를 들어내며 살짝살짝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찰방
두번째 물소리에서는 밤바다의 어둠에 스며든채 인형이 독백하는 여자의 밤산책을 따른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지...어쩌면...둘다 속고 있었던걸수도"
중저음의 목소리가 그녀의 독백에 답을 한다
바닷속에서 한청년이 스멀스멀 뭍으로 상체만 들어내어 나온다
아니 상체만 들어낼수밖에 없는것이지만
그의 하반신은 달빛에 반짝이는 푸른 비늘로 되어있었고 귀는 지느러미처럼 생겼었다
뭍에서 불리우길 그 '인어'라 불리우는 형체로 그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갔다
"허공에 말하는건 여전한것같네"
"안녕,오랜만이야"
그는 처음으로 여자에게 인사를 건내고 그런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쯤 미소가 걸린얼굴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
103 이름 없음 (78911E+63) 2016. 4. 12. 오전 6:43:29>>96 갱신할게. >>95, 어느 때라도 좋으니 이어줄 수 있을 때 이어줘! :D
-
104 이름 없음 (51901E+63) 2016. 4. 12. 오전 7:57:40>>100
남자는 소녀가 그를 쓰러트리자 약간 당황했어. 소녀가 정원사 빌의 손녀 쯤 될거라고 예상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등 뒤의 날개가 오래 전 고서에서 읽었던 흡혈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마시며 영생을 살아간다고들 했었지. 그나마도 요즘은 대대적인 ' 사냥 '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흡혈귀에게 피를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 아마도 죽지 않을까 싶었지만.
소녀가 남자의 귀에 속삭이자, 남자는 흐릿하게 웃어보였어. 남자에게 있어서 삶이란 것은 그리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기껏해야 해가 진 밤에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인데 죽음이 무서울리가 있겠어? 오히려 죽음이란건 친구같은 느낌이었어.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꼬박꼬박 만나러 오는 친구.
"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
남자는 생각했어. 자신의 피가 과연 도움이나 될까, 싶었지. 남자는 소녀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꽤나 좋지 못한 식재료였으니까. 그런 자신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남자로서는 그것도 큰 행운이었어.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게 있었어. 남자의 부모님이었지. 늘 죽음의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던 남자라고는 해도, 흡혈귀에 당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슬퍼하실게 뻔했거든.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건 바로 소녀였어. 남자의 아버지는 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세력가여서, 흡혈귀를 소탕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소녀가 위험해지는건 시간문제였으니까.
"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
" 제가 죽는다면 사고사로 위장해주실수 있습니까? " -
105 이름 없음 (70272E+61) 2016. 4. 12. 오전 9:29:43>>102
"......"
독백에 맞부딛혀 들려오는 목소리
잘못들은 걸까 생각하고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녀는 발이닿는 그곳에서 항구의 지면만 둘러볼 뿐,
이제 막 뭍으로 몸을 드러낸 이형의 모습이 시야에 맺힌건 그가 직접 말을 건네온 때쯤이었다.
"오랜만, 인걸까요?"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들었을만한 목소리였다. 아마도 불확실한 기억의 편린,
중저음의 목소리라면 한명 익숙하지만 '내가 이런 이를 알고 있었나?'라고 자신에게 되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No였다.
자신이 상대의 생김새를 알고 있지 않은, 목소리만 알고 있던 이는 몇 안되었으니까.
"어쩌면, 오랜만이겠네요..."
여자의 손치고는 보기 흉한 그것을 다른 손으로 감춘채, 그녀는 생긋 웃어보이며 그의 인삿말에 대답했다. -
106 이름 없음 (12645E+58) 2016. 4. 12. 오전 11:22:34>>96
[뭐야아아아 그게.]
김이 샛다는듯이 드래곤은 소년에게서 꼬리를 조금 떨어트려 땅바닥에 파닥파닥대었어. 으아아... 저 인간은 먹기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들지만 그게 진짜 왜 그런것인지 소년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기가 막힐 뿐인거 있지? 하지만 뭐... 그래도 울음기가 조금 진정되어보인걸 보자 아까보다 지루하고 찌증나는 기분이 드래곤 안에서도 사라지니까 한결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드래곤은 오랬동안 한 자리에 있느라 결리는 몸을 움직여 자세로 바꿧어. ...그냥 넙죽 있는 자세에서 옆으로 넙죽 업드린 정도의 차이였지만 말이야. 그러다가 정말로 아무 생가규없이 그냥 말했어.
[...근데 그렇게 널 죽고싶게 만드는 정도의 사람들이면 밉지 않아? 어차피 죽을거 그냥 다 같이 먹어줄까? 어차피 인간 하나는 나한테 배부른 감이 없어서 널 먹으면 그 다음에 사냥하러 나가기는 해야하거든.]
뭐 그냥 진짜로 내뱉은 실없는 소리였나봐. 드래곤은 그 말을 하고는 하품을 하다가 네 표정이 좋지 않아질까봐 다시 말했어.
[농담이야. 농담. ...좀 추워졌네. 으으으...]
후루루룩 하고 아주 작게 불을 뿜어 소년과 자신 사이에 소년의 걸음우로는 약 6걸음 떨어진 곳에 소년의 반만한 크기의 불을 낸 용은 불길속에서 소년의 붕대 사이로 보이는 흉터를 보고는 그냥 으쓱일 뿐이였어.
/////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 그러고보니까 진짜 길어지는것 같은데 여기서 4레스 안에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1:1로 가는것도 좋겟네. 이쯤에서 살짝 소년과 드래곤 사이의 엔딩에 대해서 해피라든가 베드라든가 하는 방향을 정해두는게 나을 것 같아. -
107 이름 없음 (64263E+62) 2016. 4. 12. 오후 2:25:54소년이 드래곤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자, 드래곤은 조금 실망했다는 목소리로 탄식하다가 자세를 고치며 소년을 바라보았어. 소년은 다시 고개를 들고, 드래곤의 두 눈을 바라보았어.
소년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들도 모두 먹으면 안 되냐는 드래곤의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어. 비록 자신을 따돌리고, 욕하고, 내쫓아버린 사람들이 밉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
농담이라고 하며 자신이 한 말을 정정하는 드래곤을 보고,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이다가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 드래곤이 불을 뿜는 것을 보자 소년은 순간적으로 흠칫하며 놀라다가도, 한편으로는 드래곤이 뿜은 그 불이 신기해서 잠시 동안 그 불을 바라보았어.
소년은 계속 뒷짐을 지며 숨기려 했던 두 손을 서서히 앞으로 내밀었어. 그리곤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보다가, 드래곤을 바라보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 저기, 드래곤 님도... 혼자 지내시고 계신가요?"
고요하고 어두운 동굴을 둘러보던 소년은 처음으로 드래곤과 대화를 하려 했어.
// 괜찮아,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음... 4레스 안에는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1:1 시트 보트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엔딩을 낼거라면 해피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 :D
아, 그리고 난 항상 9시가 지나야지 여기에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조하고. -
108 이름 없음 (64263E+62) 2016. 4. 12. 오후 2:26:24아, 앵커다는걸 깜빡했네. >>107은 >>106의 답레야!
-
109 이름 없음 (8991E+66) 2016. 4. 12. 오후 8:20:26갱신!
-
110 이름 없음 (15179E+60) 2016. 4. 12. 오후 9:39:15>>107
그녀는 정말로, 내일까지 기다려서 안된다면 소년을 먹어버려야겟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마음이 아주 무심해졌었지. 아아아 이렇게 오늘도 심심한 하루를 보내는걸까. 라고 생각하다가 소년이 자신의 말에 뜨악하고 안심하는것을 조금 재미있게 바라보았었어. ...죽이면 또 이걸 못보겟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드래곤은 오동통한 소년의 볼이라든가 눈동자같은것을 조금 더 찬찬히 바라봣어. ...좋아. 이제 십년은 잊지 않을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년이 말하기 시작했어. 이건 꽤... 새로은 반응이네?
[뭐 그렇지. 헤츨링때 몇십년 엄마의 사촌들이랑 왕이 길러주다가 그대로 마왕이 태어나서 자기가 마왕의 운명을 열어버리자마자... 그대로 이렇게 혼자살아왓지. 쭈욱. 정말 못해먹을 일이야. 그놈의 영혼세뇌때문에 나는 새벽을 오지 않게 하는 이 운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대로 있게되었다고. 게다가 난 앞으로 몇천년은 더 안죽을거고...]
세상 모든 운명과 예언들이 적힌 드래곤의 보물인 그 책들을 보던 때를 생각하며 또다시 소년이 놀랄만큼의 큰 한숨을 쉰다.
///
미안. 9시에 보기 좋게 그쯤에 이으려고 했었는데... 음. 그럼 1:1 시트스레에서... 인가 본스레서인가. 거기서 얘기 마저하면 될까? -
111 이름 없음 (73223E+65) 2016. 4. 12. 오후 9:48:27>>110 응, 1:1 시트 보트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D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그럼 1:1 시트 보트에서 만날까?
-
112 이름 없음 (12645E+58) 2016. 4. 12. 오후 9:50:23>>111 저런. 괜찮아? 음. 알았어. 편할때 이어줘. 그럼 시트스레에서 봐
-
113 이름 없음 (73223E+65) 2016. 4. 12. 오후 9:52:33>>112 응, 그럼 시트 보트를 갱신하도록 할게. 거기서 보자!
-
114 이름 없음 (1967E+69) 2016. 4. 13. 오후 2:03:16흡혈귀 참치야... 바쁘니?
-
115 이름 없음 (48974E+59) 2016. 4. 15. 오후 7:35:53>>89로 마지막 띄우기
-
116 이름 없음 (54401E+55) 2016. 4. 17. 오후 12:34:26"신성국의 왕녀님을 직접 알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검은 머리의 청년은 여전히 몸을 바싹 숙여 예의의 자세를 갖춘 채로, 어눌한 서양 발음을 통해 감사의 예를 표했다. 화려한 빛깔의 글라스로 이루어진 궁전,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벌꿀 같은 색의 머리칼, 백금의 기사들. 서로의 영토를 검과 활로 넘나드는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싸늘한 시선이 꽂혀왔다. 그야 그럴 법도 하겠지. 청년의 나라인 청환국에서 보낸 사절단은 귀족도 왕족도 아닌, 평범한 상인 한 명과 짐꾼들 뿐이었으니까. 그러나 국제적인 예우나 통상적인 관례를 비롯하여 언어 정도는 익히고 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신성국의 왕녀, 차기 권력자이자 실세인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진기한 물건들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깊고,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청환국은 이런저런 지방의 골동품들을 주로 취급하는 상인인 자신을 보내온 것이었다. 그러나……
"본국, 청환국의 왕께서는 피로 물든 과거의 역사와 오해를 풀기 위해 신성국과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로 신성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목소리에 희미한 떨림마저도 지우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왔다. 모든 것이 허투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은 물론 청환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테니까. 영토 협조 조약에 관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여럿 유치하기 위해 그녀에게서 호의를 얻어내, 신성국의 황제에게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상인인 청년에게 내려진 무거운 임무였다. 그러나 만약 이 임무가 실패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녀에게 독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해야만한다. 마치 멈춘 것만 같은 황궁의 시간 속에서, 청년 역시 숨을 멈추었다. -
117 이름 없음 (27094E+56) 2016. 4. 17. 오후 1:58:36>>116
신성국의 황제는 늙고 약해진지 오래였다. 현재 성국의 실세는 그의 딸인 제 1 황녀. 그녀가 황제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었다. 그러니 이런 달갑지 않은 손님 또한 맞아야하는거겠지. 청환국에서 온 청년의 인사를 받으며 그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 분명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땅을 침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시대가 지나간 이 자리에는 싸늘함밖에는 남아있지않았다. 이 상황에서의 친목이란 더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한 발버둥일 뿐.
황녀의 고개가 삐딱하게 꺾였다.
"그대는 왕족인가?"
아니었다. 적국이나 다름없는 곳에 소중한 핏줄을 보낼리는 없겠지.
"그대는 나라를 대표할만한 대귀족인가?"
그것 또한 아니었다. 귀족이란 족속들은 대개 겁이 많은 인간들이므로.
"그대는 외무대신인가?"
그래. 그래야했다.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더라도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왔어야했다. 그런데... 상인한 명과 그의 짐꾼들이라니. 친목을 도모하고자 보낸 사람이 상인이란 말인가. 상인에게 화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태도에 화가나는 것일 뿐. 그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신성국을 우습게 보는 것일까. 상인에게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기사들과 귀족들 모두 말은 하지않지만 굉장히 기분나쁘다는 얼굴이었다.
"피로 물든 과거의 역사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라... 그대는 청환국에서 상인 한 명과 그 짐꾼들만 보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가치를 증명해보이라는 말이었다.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평범한 상인 하나를 보내는 일 같은 것은 가문과 가문 사이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
118 이름 없음 (54401E+55) 2016. 4. 17. 오후 6:43:14>>117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황녀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마치 주변의 분위기와 그녀의 어투에서부터 고체화 된 가시들이 온 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다. 물리적인 아픔처럼 느껴질 정도의 위압감.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주장했다. 한 나라의 사절단이 아닌 상인의 입장으로써 접근하면 안되겠냐고. 그러나 그러기에는 시간도 짧을 뿐더러, 황녀를 직접 뵐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청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술을 꾹 깨물었다. 불가능한 흥정이다, 이것은. 부모의 원수에게 상품값을 반절이나 깎아내라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닙니다."
물담배를 물고서 여성들에게 둘러쌓인 채로 비웃는 왕족의 그 입꼬리를 기억한다.
"아닙니다."
'가족은 잘 보살펴주도록 하지.'. 자신이 있는 도시의 영주인 자가 보내던 딱한 것을 보는 시선을 기억한다.
"…아닙니다."
그저 자신은 소모품이다. 갈퀴 같은 감정들이 기억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신경을 긁어갔다. 황녀가 하는 말에는 정당한 의문과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가족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은 무르지 않다. 청년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마른침을 삼켰다. 관자놀이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제게 한 나라의 사절단으로써의 자격이 없음은 청환국 측에서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편성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도심이든 지방이든 전후 복구 작업으로 서민들을 한 명이라도 빨리 구제하기 위함으로 인해 마땅한 유동 인력이 없었을 뿐더러, 겉멋만 들인 서로에게 무익한 외교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제게 따로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사절로 온 상대 국가의 귀족이나 왕족을 죽이는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음으로서 자리에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 같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서민을 죽인다는 것은 양측에 무익, 무해일 뿐더러 명분도 책임도 없다. 그야말로 청환국에서 던진 초유의 사태이면서 승부수다. 과연 긍지와 자존심인가, 호기심이 먼저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청환국에 흩어져있던 신기들을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가치가 없으나, 제 상품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한순간만큼은 상인으로써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다. -
119 이름 없음 (27094E+56) 2016. 4. 17. 오후 9:12:21>>118
묵묵히 청년의 말을 듣던 황녀는 실소를 감추지않았다. 사신으로 보낼 마땅한 인력이 없고 겉멋만 든 무익한 외교를 하고 싶지않다? 이처럼 뻔뻔한 말이 어디있을까. 웃기는 노릇이구나. 그렇게따지면 지금 저 상인은 버리는 패에 가까울 것이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그런 패. 그런 청환국의 태도에 욕지거리가 나가려는 것을 참으며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잠시 감았다.
황녀가 침묵할동안 귀족들은 흥분하여 매섭게 청년을 쏘아보며 저들끼리 속닥거렸다. 그 속닥거림의 절반은 청환국에 대한 욕이요, 절반은 저 상인의 목부터 치자는 말이었다. 그 속닥거림을 들으며 황녀는 다시 눈을 떴다.
"...참으로 무례하고 뻔뻔스러우며 이기적인 족속들이구나."
그녀가 입을 열자 주위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인을 향한 매서운 눈빛들이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마땅한 인력이 없고 겉멋을 들이지않고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싶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거늘, 그것 조차 갖추지 않은 그대들의 뻔뻔함에 박수를 치고싶을 정도다."
싸늘한 침묵만이 감도는 궁 내에 황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만이 울렸다.
청환국, 당신들의 속셈은 무엇일까. 신성국과 친목을 하고싶다는 것일까, 전쟁을 하자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단지 자신을 떠보기위한 장난질일까.
황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의 자신감이 헛됨이 아님을 그대가 가져온 물건들의 가치로 판단하겠다."
귀족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 전에 그대는 왜 따로 알현을 청하는지 설명해야할 것이다."
그녀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
120 이름 없음 (27094E+56) 2016. 4. 17. 오후 9:18:22>>119 이마를 짚으며->이마를 짚고
'~며'가 두 번 들어가다니... -
121 이름 없음 (89764E+53) 2016. 4. 18. 오후 4:22:25갱신
-
122 이름 없음 (99447E+56) 2016. 4. 19. 오후 11:07:13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창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어두침침한 사무실 안
아직 소년티를 벗지못한 남자아이가 다른 검은 양복의 어른들에게 둘러싸인채 골프채를 휘두르며 퍼딩을 연습한다
보통의 아이라면 주변의 어른들 분위기에 눌려 눈만 꿈벅거리며 떨고있을테지만 그아이는 달랐다
오히려 그 어른들을 본인이 분위기로 눌려놓은듯한모습
조용한 사무실안에서 골프채만이 묵묵히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낸다
곧이어 조용하던 사무실의 분위기를 깨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용서를 비는것같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문이 열리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도살장의 소처럼 양복을 입은 어른들에게 끌려나온다
그리고 아이는 골프채를 집어던진채 엎드려진 남자를 반기는 표정으로 다가간다
"아아 어서와요 우리 구면이죠? 한 작년쯤에 ...돈빌려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기억이없어서...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깨면 안되는거고"
그의 뺨을 잡고 아이는 얼굴을 들이 밀며 눈을 맞춘다
"이렇게 어린 저도 아는데 그쪽이 지키지 않으면 ...
학교때 안배우셨나? 약속을 안지키면 호온난다...라고 ...아하하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갚을방법은 많으니까 ..피,피부,신장,각막 봐요! 아저씨는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남자니까
제가 그냥 돈을 빌려드린게 아니라고요"
아이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아까와는 대조적으로 얼굴에 웃음을 한껏 머금은 모습이다
"혹시 마지막 할말같은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님 따로 갚을 방법이라고?
아! 연장같은건 안되요 저희도 많이 기다린거니까" -
123 이름 없음 (77568E+52) 2016. 4. 20. 오전 12:29:14>>122
송곳으로 찍혀진 발이 더럽게 아프다 못해 죽을 맛이였다. 빠져서 덜렁거리는 이가 부워 오른 눈 사이로 바닷에 몇개 보였고, 입과 코에서 자신의 피냄새가 나는 채로 또 한번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각목같은것으로 가격을 해버리자 자신의 입에서 절로 비명이 나오며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 그러던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묶은 의자에서 풀어주며 강제로 어느 방에 끌고 들어가자 그는 분명히 장기라도 적출되겟다 싶어서 발버둥치려 했으나 몸에 그마저의 저항을 할 힘도 빠져서 너무나도 쉽게 끌려갔다. 그러자 그의 눈에 보이는건... 골프채를 던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내들에게 기가 눌릴법도 하건만 그들의 위에 앉은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당당한 소년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으윽...!"
맞느라고 입 안쪽 살이고 바깥쪽 살이고 제대로 다 까지고 부운 뺨이 잡히자 드럽게 아팟다. 젠장. 내가 그러게 사채만큼은 안쓰려고 했는데 개노무 시키. 그걸 들고 나르고... 젠장. 이제와서 그걸 탓해봣자다. 하하. 그나저나 피는 몰라도 피부는 제법 상했고... 각막이랑 신장이랑 골수...가 아니라. 죽고싶지 않아! 죽고싶지 않다고!
"가... 가ㅍ으바법..."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세는것이 짜증났다. 이런 상태로는 알려버리기 힘들 것이다. 젠장 뭘 써서라도 전해야지...
"이셔 이다고... 조...조이라... ㅍ...페좀..."
최대한 펜으로 무언가를 쓰는듯한 제스쳐를 취하며 고통인지 절박함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는채 소년을 본다. -
124 이름 없음 (66463E+57) 2016. 4. 20. 오전 1:37:14뭔가 방법이 있다는 남자의 말에 의문스러운 얼굴을 짓는다
그리곤 자신의 정장에서 비싸보이는 만연필한자루를 꺼낸다
"? ...종이 ...종이 가져와라고!"
종이가 원하는대로 손에 쥐어 지지않자 성질을 내는 아이
그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자 사무실은 한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와중에 한 스킨헤드가 그에게 종이를 건낸다
"써봐...천천히 써보자구 근데말이야..."
아이는 바닥에 종이를 내려놓고 그의 손등위로 만연필을 세게 꽂아넣는다
"시간은 금이라잖아? 시덥지 않은거면 나도 모르게 아저씨한테 화풀이 할수도 있어
이해하지? 응?
나도 지금 아저씨의 자금사정을 이해해주고 있잖아 쌤쌤인걸로 치자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
125 이름 없음 (84956E+50) 2016. 4. 20. 오전 2:03:35>>124
남자는 얼른 세차게 끄덕이며 두 손으로 그 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던중에 소년의 명령에 왠 대머리가 갖고온,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이를 한 손으로 잡고 쓰라는 말에 얼른 펜을 받을 준비를 하였다. 그러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악!!!!!! ...! ..!!!!!"
소년이 박아버리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곧 그것또한 소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남자는 재빨리 반대편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납작 업드려 부들부들 거린채 비명을 막다가 남은 이가 시릴 정도로 이악물고 입을 다문채 펜을 뽑아낸다. 종이... 종이가... 아. 그래도 그나마 반은 쓸곳이 남아있다. 게다가.. 다행이도 글을 쓰는 손은 반대편이였고. ...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둑같았다. 그러나 살려면 써야만 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이 지금 고통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라든가 현기증날만큼 몸에서 새나가는 피가 종이에 묻지 않게 하면서 써야 하는 것들을 써버렸다. 상황이 상황이라 종이에 쓰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잘 쓰도록 노력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글은... 얼마전에 비리혐의 및 각종 청탁으로 인해 난리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진 모 국회의원의 이름과... 해외의 은행 이름인 영단어, 계좌번호로 보이는 숫자였다.
씨이이.......ㅂ.... 그래. 내가 이걸 알게 되다가 참 더러운 수모를 겪다가 이자식 돈을 그새끼 협박때문에 빌리게 되고 그새끼는 통수를 제대로 쳐서 도망치다가 잡힌게 지금이였지...
//으음...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쓰느라 개연성이 많이 없넹... -
126 이름 없음 (66463E+57) 2016. 4. 20. 오후 10:03:24그의 종이를 집어 눈앞에서 흔들흔들 잠깐 흥미를 보이는듯 싶더니
큰소리로 웃어버린다
" ...아저씨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거라고 생각해?이런 종이쪼가리하나로...겨우 아저씨 빚조금 얻자고 이런 거물을 건들이자고?
아하하 그거정말 좋은생각인데 그래?"
"이봐,골프채"
직후 다시 스킨헤드에게 멀리떨어진 골프채를 받아 종이를 꾸깃꾸깃 공으로 만들어 스윙으로 날려버린다
"가끔 말이지 내가 아직 어리다고...부모님 빽으로 자리에 앉은거라고 비아냥거리는 어른들이 있어
정작 내가 부모님한테서 얻은건 사랑의 매 뿐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남자
"난 우리 부모님이 날 때린걸 원망하지 않아 ..그건 잘못한 날 바로 잡기위함이니까
나도 잘못한 아저씨한테 그럴려고 너무 원망은 하지 말아줘"
"자, 교정당하기 전 마지막 말은? 아 종이"
그에게 남은 기회가 떠나기 직전인듯하다
//괜찮아 나도 그러니까...글을 잘쓰는편은 아닌지라
즐기면 그만이잖아! -
127 이름 없음 (92858E+50) 2016. 4. 21. 오전 1:12:03>>126
소년의 말을 듣던 남자가 생각한 것은 아주 간단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성격파탄... 하긴. 이런 직종들 성격은 아주 훌륭한 사무직에 어울릴 성격이거나 저렇게 제대로 돌아야 가장 어울리는 성격이겟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맞는데 익숙... 은 개뿔. 저 골프채로 맞는건가 싶어서 움찔거리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이미... 엎드렸으므로 다시 엎드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진짜 이제 자신의 마지막 패는 사라져버렸다. 역시 위기기는 해도 거물이니 저놈도 건들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하며 남자는 필사적으로 생각에 생각을 해본다. ...만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친구라고 둿던 유일한 새끼가 나한테 사채빌리게 해서 돈만 들고 냅다 튀어버린 그새끼였다. 거기다가 따로 돈을 들고 올 패가 없기도 하고 당장에 여기있는 사람들을 다 두둘겨패며 도망칠 그런 사람도 아닌게 자신이니...
이런 젠장, 희망이 없다. 희망이. 웃음이 나올 것 같을 만큼 어이없을 정도로 희망이 없다. 젠장. 죽고싶지 않은데...
///
그리고 나는 죽겟지... -
128 이름 없음 (01342E+55) 2016. 4. 21. 오전 2:06:24'엄청난 얼굴....'
"뭐예요? 할말 없어요? 거참...돈 몇푼 못벌어서 이게 무슨꼴이랍니까"
반항없는 고깃덩어리를 건들자니 재미없을것같은 상황에 아이는 다시 무표정을 한다
발끝으로 그의 얼굴을 들어올리자 처참한 그의 얼굴이 들어올린다
"흐음...우리 시간도 많은데 옛날이야기라도 해볼까?
아저씨 직업은 뭐였어?"
아이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알아서 시가를 물려주는 어른들
한번 구름을 내뱉고서야 다시 한번 그에게 다정하게 질문해준다
//으앙 더돌리고싶은데 -
129 이름 없음 (06338E+48) 2016. 4. 21. 오전 2:11:06...살려줘서 오히려 놀랐어...
-
130 이름 없음 (06338E+48) 2016. 4. 21. 오전 2:29:31>>128
강제로 망할 발로 사람 얼굴이 일으켜지자 엉망진창인 얼굴이 찡그려진다. 씨... 진짜 경험상 이정도쯤으로 다치면 안 맞은 곳이든 맞은 곳이든 일단 몸이 건들여 졌다는 것 만으로 더럽게 아프다.
"으....!"
그 돈 몇푼때문에 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라는 말이 입밖으로 나오려는걸 꽈악 참는다. 일단 변덕이라도 난것인지 자신에게 나름 여유있게 대하는 꼴을 보자니 위장이 쓰려온다. 너같으면 자기를 피떡으로 만든 인간이랑 참 할말이 많겟다만... 일단 살 시간은 벌었다. 뭐 그래봣자 저 소년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잠깐이라는 느낌이 오지만...
콜록, 콜록, ㅋ...
꼬맹이가 나도 한 번 시도했다가 그만둔 독한 시가를 피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기침이 나는 것을 멀쩡한 손으로 막고 잠깐 쉼호흡을 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를 쏟은게 많아서 그런가 머리도 좀 멍해지기 시작하고... 아니지. 정신차리자 정신. 그러니까... 난... 어... 일단 좀 얌전할때 저 상태를 유지시켜버리기라도 해야하니까 말을 꺼내야 하는데. 정신이...
"시부르 겨 배다어자... 여지."
이가 나간게 몹시도 서러울 지경이였다. 그와중에도 점점 몸이 추워서 덜덜거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려는걸 붙잡기 위해 가볍게 자기 머리통을 두들기려다가 움직인 손이 아파서 정신이 잠깐 번쩍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춥고... 젠장. 죽으면 안돼는데...! -
131 이름 없음 (40289E+56) 2016. 4. 22. 오전 12:55:31갱신
-
132 이름 없음 (10007E+54) 2016. 4. 30. 오전 4:07:37창백한 흑발과 하얀 피부 위로 더욱 창백한 붉은 피가 흘렀다. 고통으로 인해 피부가 일그러진 청년이 송곳니가 드러난 입을 쩍쩍 벌리며 아픈듯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청년의 목을 관통한 칼이 목소리를 막아버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청년은 이미 한 시간 전에 칼에 찔린채 계속 이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야 야지만 청년은 식은땀과 피가 더 많이 흘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채 계속 아파하였다.
'젠장... 이쯤이면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았잖아?'
라고 한 40번쯤 넘게 생각하였을때쯤, 마침내 청년에게 불사를 확인한다면서 대뜸 목에 칼을 박았던 사람이 칼을 빼내어버리자 청년은 켁켁이면서 목과 입을 막고 바닥에 수그려 기침을 해대었다. 그리고 청년이 1분 뒤 기침을 멎으면서 일어서서 그 사람을 노려볼때 이미 그의 몸에 난 상처를 사라져 있었지만 곧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기에 차러리 저 사람에게서는 용건만 빨리 해결하고 가야겟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이제 제대로 확인했지? 난 안죽어. 게다가 안 늙지. 너네들이 말하는 절대적인 불노불사를 내가 갖고 있어. 그리고 난 같은걸 남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서 그걸 파는 상인이야. 알아들었어? 이제 제대로 확인했을테니까 말해. 돈을 주고 나에게서 이것을 사가겟어, 아니면 그냥 돌아가겟어?"
//불노불사를 팔 수 있는 죽지도 늙지도 않는 남자와 손님! 이라는 상황인데 있으려나... -
133 이름 없음 (76848E+51) 2016. 5. 1. 오전 12:01:26갱신
-
134 이름 없음 (23512E+57) 2016. 5. 1. 오전 2:46:10ㄱㅅ
-
135 이름 없음 (40775E+58) 2016. 5. 2. 오전 12:55:56꿀꺽. 꿀꺽.
겉우로는 어쨋건 소년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는 자신의 이빨을 박아넣은 그 자리에 상처를 벌리며 피를 마시면서 새삼 자신이 지금 피를 빠는 인간의 안샥이 새파래지며 팔이 사시랑이처럼 떨리는 것을 보며 어딘가 식욕이 자극되는 것을 느꼈다. ...그듕안 굶어온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정도의 인간이 몸에 체우고 있는 피 정도쯤 한방울도 남김없이 뱃속에 넣을 수 있을테지만 그는 아쉬운듯 이를 떼고 자신이 이를 박아넣고 휘저으며 피를 빨던 그 자리를 한번 혀로 핥은 후에 피를 빨아먹은 인간이 죽기 전에 자신의 혀를 깨물어 내는 피를 입안 가득히 채워 이빨로 낸 구멍을 통해 직접 자기 입으로 피를 불어넣은 뒤 기절해버린 인간이 깨어날때 까지를 기다렸다가 깨어나자마자 조용히 말하였다.
"그래... 원하는대로 나를 통해 동족이 된 기분은 어때?" -
136 이름 없음 (47551E+59) 2016. 5. 9. 오후 6:34:33[뭐하냐 1] [자? 1] [아나 1] [미안하다니까 1] [(울음) 1] [진짜 거짓말ㅇ임 리얼 1] [니몰래 디저트머그러 갈ㄹ리업잖아 1] [오늘 우리집 올래 1] [??? 1] [호러겜 ㄱ 1]
-
137 이름 없음 (16081E+53) 2016. 5. 9. 오후 7:20:19갱신
-
138 이름 없음 (25436E+54) 2016. 5. 10. 오후 6:04:54갱신
-
139 이름 없음 (95219E+51) 2016. 5. 17. 오후 8:55:16"I have a story to tell
Do you hear me tonight?
It's a things about me- yea-a-
I'll be waiting in bedroom, but anyway you can't come... I get it, never mind.
Now it is starting to rain
I feel you drop tears
And my heart became heavy, yea-
What's this world coming to?
There's nothing that can be done
I couldn't careless...
It's wonderful for me that world is moving now, Some lights turn around and aroud-
I lost my head again,
And just want to throw everything away
It's not that easy...
Maybe I'm afraid I'm not as tender guy as you think.
Looking your eyes, and I say "love you" with fake smile-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should I do,
Just feel so sad inside, but I kiss you,
Kiss you..."
남자의 목소리가 낡은 기타와 함께 조용하고 느리게 울렸다. 아무도 없어 고요하다 못해 울적하기까지 하는 골목길에 그 목소리의 여운이 돌다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골목길 벽에 기대어 앉은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한 채 머리를 벽에 기대었다. 눈에 가득 밤하늘이 들어온다. 또 너가 들어온다. 남자는 어쩐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러삼켰다.
꽃다운 너가 하늘로 날아가버린지 어느새 5년. 너는 점차 흐릿해져갔지만 오늘같은 날엔 짙고 짙어져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러니 내가 어떻게 널 잊어.
남자는 결국 울음섞인 한숨을 뱉어내고야 말았다.
(노래는 about me-아라키 ver. 하지만 그것보단 조금 느린 분위기? ) -
140 이름 없음 (56102E+48) 2016. 5. 18. 오후 6:36:10>>139
내가 죽은 지 벌써 5년이다. 죽은 주제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아냐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속해 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골목에서 울리는, 이런 침침한 골목에서 울리기엔 아까운, 내가 알고 지냈던 아이- 이젠 아이는 아니구나... 아무튼, 그 애의 상냥한 기타와 노랫소리 때문이었으니까. 5년간 늘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모른 체 해야지, 다 부질없다고 느껴서 이런 데 와서 궁상맞게 나같은 애나 떠올리면서 우는 짓도 그만두고, 내 죽음 때문에 받은 상처도 희미해질 수 있게 해줘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이 소리가 들릴 때면 늘 이곳에 있는 나를, 동시에 내가 올 때마다 내가 보인다는 듯이 이 쪽을 보며 우는 그 애를 보다 못해, 이젠 똑바로 녀석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랫소리가 멎자, 들리는 물기섞인 한숨 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이 가여운 녀석을 향해 고개 한번 돌려볼 생각도 못한 채, 행여 들리기라도 할까봐 입은 꼭 다물고 있자 결심했던 것을 깨고, 들리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처음으로 5년의 세월동안 꼭꼭 묵혀둔 구박을 처음으로 중얼거렸다.
-어유, 이 화상아. 5년이나 그러고 지냈으면 좀 나아져야 할 거 아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쉬질 못하잖아. ...제대로 된 해결책도 못 주는 주제에 내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거 네 정신건강에 나쁘다고...
걱정이 돼서 떠나지 못한다는 건 순전한 핑계였다. 그래도 1년 정도 저러다 어떻게든 멀쩡해졌더라면 살짝 착잡하긴 해도 내 걱정은 부질없구나, 하고 훌훌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만. 꼴이 이 꼴이다보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주선해주지 못하고 저러는 모습만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
141 이름 없음 (69011E+55) 2016. 6. 1. 오전 12:56:43-방해하지 마, 나가, 나가! 나가라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눌리는 기분이였다. 자신에 지켜야 할 소년을 붙잡고 목을 조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까만 형체는 아무리봐도 이세상의 것이 아니였으며 그 앞에 선 자신은 너무나 작았다. 그것이 눈을 부릅 뜨며 노려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주변에서는 시체 냄새가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켜야 할 소년이 저렇게 창백한 얼굴로 숨울 쌕쌕이니까.
"방해하는건 너야. 넌 절대 그 사람의 몸을 차지하지 못해. 객은 객이 될 수 없어. 돌아가."
-방해 말ㄹ...고!!!
.
.
.
그리고 어느 순간이였다. 분명 귀신에게 잡혀서 생사를 넘나들던 소년은 별안간 개운해지는 느낌에 눈을 뜨자마자 엉망이 된 자신의 방과, 늘 그렇듯이 그런 자신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잠들어있는 또다른 소년과 눈이 마주친다.
-----
귀신이 잘 쓰이는 약한 재벌집 도련님×도련님께 고용된 강한퇴마사 인데 이어줄 사람이 있으려나... -
142 이름 없음 (94691E+60) 2016. 6. 1. 오전 2:01:24>>141 오오 설정 좋다. 잇고 싶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141이 도련님 시점인 거야?
-
143 이름 없음 (69011E+55) 2016. 6. 1. 오전 2:25:05>>142 엇!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
.
.
전까지는 퇴마사쪽이고 그 뒤에 그리고 어느 순간이였다. 부터가 도련님 시점이야. -
144 이름 없음 (94691E+60) 2016. 6. 1. 오전 3:03:05>>143 그럼 나는 퇴마사 시점으로 쓰면 되는 건가? 머리가 나빠서 미안해..
-
145 이름 없음 (69011E+55) 2016. 6. 1. 오전 9:56:02>>144 답이 늦어서 미안해! 엄... 사실 일부러 두 사람의 시점을 썻던 이유가 잇는 사람이 누구든간에 원하는 시점으로 잇기 편하도록 쓰려고 그랬던 거였어. 원하는 쪽으로 이어줘!
-
146 이름 없음 (94691E+60) 2016. 6. 1. 오후 6:27:32>>141
" ...아, 일어나셨네요. "
도련님이 눈을 뜨신 듯하다. 나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났고 말이다. 아무래도 도련님에게 씌인 귀신을 퇴치하고는 바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나보다. 이걸로만 생각해보면 나도 어지간히 지쳤나보지. 그나저나 방이 상태가 말이 아니네. 아마 귀신이 쓰였던 도련님과 그 귀신을 퇴치를 하려던 내가 낸 결과이니라. 퇴마를 하는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다소 다혈질적으로 변하니까. 음 가정부라면 따로 있기는 할텐데 어지럽힌 것에 대한 책임 중 최소 5할은 나에게 있으니 이번만 가정부를 배려해주도록 할까.
"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
자면서 잡고 있던 도련님의 손을 고쳐잡으면서 차분하게 물어보았다. 남자끼리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이 낯부끄럽지는 않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는다. 나와 도련님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말이다. 나는 그저 귀신에 잘 씌이시는 도련님을 위해 고용된 어린 퇴마사일 뿐이다. 관계를 좁힐 이유도 없다. 어디까지나 도련님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관계까지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도련님을 위해 고용된 어린 퇴마사일 뿐이니까.
" 이 방은 우리가 어지럽힌 것이니 저라도 살짝 정리해야겠네요. 도련님은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돼요. 도와주셔도 크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
태연하게 말한 다음에 일단 바닥에 널부러져있는 책 하나를 들어 책꽃이에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쓰레기가 좀 있어 빗자루는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났다. 이제라도 생각 났으니 오히려 다행인 건가...
" 아, 잊을 뻔 했네요. 오늘은 이 부적을 하루종일 몸에 지니고 계셔주세요. 고가의 부적이지만 도련님이 하도 빙의에 좋은 체질이셔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
도련님에게 부적을 두 손으로 건네며 반쯤 농담 삼아 말한 마지막 문장에서 멎쩍은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다.
-----
늦어서 미안해! -
147 이름 없음 (34162E+54) 2016. 6. 1. 오후 7:18:50>>146
내놔... 그 ...을 내놓으라고. 내놔...
'싫어, 싫단말야 저리 가, 가라고!'
가슴이고 숨이고 전부 답답하기만 하였었다. 눈앞의 갓이 무섭고 멕멕허기만 한데다가 손발이 저릿하고... 어느순간 발작까지 하면서 덜컥거렸더가 정신을 잃은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부분부터가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았다. 아니. 드문드문 저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게다가 왠지 손이 따뜻해서 정말로 의식이 끊기기 전에는 왠지 안심했던 것 같기도 했고. 라고 생각하였는데 보니 정말로 손이 잡혀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잘못 본게 아닌지 손을 놓는다. 왠지 그 태도에 손이 허전해져서 잡혀있던 손을 눈 앞으로 갖고 와서 꼬물거려 보다가 끄덕인다. ...네덕분에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입을 여니 다른 말이 나온다.
"어제보단 좀 낫지만...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 목마르고 피곤해. 아직도 머리가 멍한게 맘에 안들어."
분명 그 무언가에게 몸이 뺏기기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에 가려고 했던 때였는데... 학교는 글렀다. 아마도. 그러다가 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던중에 머리가 울리지만 말을 한다.
"놔 둬. 어차피 자주 있는 일이니까... 치울 사람이 오겟지."
그러다가 보기 싫은 부적 목거리를 건네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거, 어차피 효과도 없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안 것인지 네가 놀리듯이 농담삼아 말을 하자 인상을 팍 찡그려 버린다.
"네가 붙어있는데 굳이 그 효과없는 것 까지 해야 할 정도로 후달려?"
어 이렇게 말하려던게 아니였는데 싶지만 왠지 진심을 말하기가 힘들다. -
148 이름 없음 (94691E+60) 2016. 6. 1. 오후 9:12:33>>147
도련님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시자 나는 그것을 모두 듣고는 얕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아무 의미도 담지 않은 한숨이다. 그냥, 여전하시구나 싶어서 말이다.
" 여전하네요. 어제보다는 좀 나으시다니 그건 그나마 다행이고...물이랑 두통약이라도 드릴까요? "
굉장히 가정부나 집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담담하게 생각하면서 무심코 시선을 돌려 창문 밖을 쳐다보았다. 꽤나 좋은 날씨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런 날에 도련님도 산책 쯤 하셔도 나쁘지 않을텐데...뭐, 어차피 학교도 오늘 결석하실 것 같으니 소용 없는 생각인가.
" 아, 그런가요. 음 주제 넘은 생각이지만 요즘 상관 없는 것에 책임감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치우면 가정부가 일을 못해 돈을 벌지를 못하겠군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그녀를 향한 배려일지도 모르겠네요... "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도련님의 말에 수긍을 표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듯 손에 들린 종이 몇 장을 도로 바닥에 놓았다. 하마터면 가정부의 돈벌이를 방해할 뻔 했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도 부정적이시구나 도련님은. 묘한 기분과 표정으로 도련님을 살짝 쳐다보다가 익숙해져야지, 생각하고는 도련님의 침대에 걸터앉았다.
" 흔히 자뻑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제 실력이 남들에 비해 뒤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며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도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하찮은 방법일지라도 저는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부적을 몸에 지녀주세요. 종이 한 장 가지고 다니는 것이 힘든 일도 아니니까요, 라고 덧붙이면서 다시 그 부적을 도련님에게 건네었다. -
149 이름 없음 (34162E+54) 2016. 6. 1. 오후 9:42:17>>148
흔한 일중에 하나지만 어제부터 계속 머리가 알딸딸하고 일어서면 피가 싹 뻐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돌아다니거나 하는 그런게 너무 싫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누워만 있는것도 싫긴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날 우울하게 스리 날씨는 좋은걸까. 난 이렇게 힘든데.
"약은 어차피 효과 없느까 물만 줘."
괜히, 그냥 불안해진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건 싫다. 나도 뛰어나가고 싶어. 아픈건 지긋지긋해. 무언가가 머릿속이나 내장을 쥐어 뜯는것도 끔직하고 맨날 약만 먹으면서 부작용때문에 헤롱헤롱 거리고 이상한게 내 몸을 가져가느라 내가 내가 아니게 되는것도... 계속 이렇게 헤롱대면서 내가 뭔지 모르는게 무서워... 싫어... 싫어...
"...알았어. 걸테니까 줘."
침대에 걸터앉는 낌새와 함께 그녀석이 말을 하자 그는 고작 자기또래일 그 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 또다시 식은땀이 나려는게... 피곤하기 짝이 없어서 싫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며 그녀석이 건넨 부적을 목에 걸었다. 솔직히 목에 뭔가를 거는것 자체가 목이 졸렸을 그때의 기분이 생각나서 싫지만 그래도 일단 그 말을 믿기야 하니까 말이다.
"...적어도, 그건 이제 내 몸에서 나간거야?"
왠지 지쳐서 그런가, 적어도 오늘안에 또 뭐가 일어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물어보았다. -
150 이름 없음 (67205E+52) 2016. 6. 2. 오후 2:50:41갱신
-
151 이름 없음 (69356E+60) 2016. 6. 2. 오후 8:02:17“외로워…외로워 죽겠어…….”
중얼중얼, 울음기에 젖은 목소리가 흘러내린다. 머리 위에 달린 흰색 토끼귀를 반쯤 접은 청년은 나무의자 위에 쪼그려앉아 검을 껴안고있다. 오랜 시간 운건지 붉게 충혈 된 눈, 눈가 역시 붉다. 머리를 푹 숙이며 짙은 한숨을 내뱉는다. 몬스터의 습격이 잦고 인적이 드문 외각의 수비를 맡은 것은 자신의 의지였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 대하는게 서툰 성격과 말투, 곧장 외로움을 타버리는 토끼의 습성이 상극을 이뤄버렸다.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은 숲 뿐. 또다시 엉엉 울며 검을 끌어안았다. -
152 이름 없음 (70476E+59) 2016. 6. 3. 오전 1:58:18>>151
[저 마을에 살면 안돼.]
[왜? 왜요 엄마?]
[이유는 당장 설명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어른에 된다면 말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주렴 내 사랑하는 아가.]
온 몸이 갈빛과 검은 색으로 얼룩덜룩던 당시의 어린 올빼미 수인은 자신의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으며 지켰다. 수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단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도, 그들 앞에도 단 한번도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가 다 자란 지금에 그의 어머니가 약속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가 다 자라기 전에 몬스터에게 죽었으니 말이다. 혼자서 사는건 힘들다. 먹이를 구하는것도 겨울을 나는것도 홀로 자기몸을 지키는것도. 하지만 커가면서 더 높이, 더 빠르게 날 수 있고 발톱의 힘도 강해졌다. 밤을 계속 보내오면서 밤눈이 좋아지고 감각이 예리해졌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한건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차선책으로 마을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될 만한 마을의 범위 안에 아슬하게만 들어가는 외곽의 근처에서 몇칠을 날밤을 새가며 그 토끼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울면서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자 그는 그 토끼귀의 앞에 소리없이 날아왔다.
"그럼 내가 같이 있을게."
라고 말하며 그와 그의 검을 바라봤다. -
153 이름 없음 (06639E+62) 2016. 6. 3. 오후 5:32:04>>152
눈썹이 없고 마주하는 상대를 노려보는 듯한 각진 눈매, 또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먼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부르르 떨리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분노를 참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먼저 다가오는 이들도 적었다. 오히려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일지도.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 조차 알 수 없다. 항상 울거나, 몬스터를 처치하거나의 일상. 그러나 그런 무미한 일상 속에 파고든 건 낯선 목소리였다.
“……!?”
울어서 그런건지, 토끼 수인이여서 그런건지 모를 정도로 빨개진 눈가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새? 수인? 부끄러움에 이를 악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지면서 위협하는 표정이 됐다.
“언제부터…들은……?”
사람에게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탓에 남는 시간을 수련에 바친 자신임에도,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여긴 잦은 몬스터의 출입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의 시선이 검으로 향하는 것 같자, 그에 반응하듯 검을 좀 더 꽉 끌어안았다. -
154 이름 없음 (71602E+58) 2016. 6. 4. 오전 12:06:15>>154
무척이나 어두운 밤이였다. 그덕분인지 달빛에 간간히 드러난 토끼의 붉은 눈이라던가 검의 테두리를 보는것도 간신히 보는것이지만 자신은 그래도 태생 자체가 밤눈이 좋기 때문에 그의 눈이 울어서 부웠다든가 인상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것도 보였다. 반면 토끼는 어떨까? 손이 있을 부분에 달린 몸길이의 두배가 되는 날개정도는 보일 것 이다. 그렇다면 노란색에 가까운 눈동자는? 신발이 있을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거대한 새의 발은? ...잘 모르겟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끝날 것 같아보이지가 않아."
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자신의 검을 껴안는 토끼수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말한다.
"넌 날개가 없네? ...귀는 왜 그렇게 큰거야?"
...그러고보니 이 올빼미 수인은 죽은 자신의 어미 외의 수인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
155 이름 없음 (51794E+61) 2016. 6. 4. 오후 4:38:59>>154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갑자기 이런 외진 곳에 사람이 나타났다던가, 커다란 갈색 빛깔의 날개를 가진─달빛을 받아 처음엔 황록색으로 보였다─수인이 있다던가 하는 것보다도, 그가 맨 처음 자신에게 건넨 말 때문에 혼란스럽다. 왜 자신은 곁에 있어준다는 말에 한순간, 안도했던걸까.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적어도 저쪽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있다. 부끄러움에 토끼 귀 끝이 쫑긋거렸다. 볼에 열기도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왜 날개가 없냐니, 그야 난…….”
거기까지 말하고,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챘다. 수인 마을에 살고있는 수인들은 저마다 일종의 신분증 개념으로 마을의 상징적인 펜던트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눈 앞의 새 수인은 목에 아무것도 메고있지 않았다. 외부인? 토끼 수인은 자리서 일어났다.
“어디서 왔지?”
본의치 않게 협박조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까 전 운 것 때문에 목이 잠긴 것 뿐이지만. -
156 이름 없음 (96055E+61) 2016. 6. 4. 오후 5:25:57>>155
하얀 귀가 달빛때문에 조금 다른 빛갈을 띄었다. 그런데 그 귀가 기분탓인지도 모르겟지만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서 더욱 기묘하거나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왜 놀라는거지? 왜 인상을 찡그리는거지? 왜? 왜? 어째서? 라고 생각하던중에 그 수인이 대답을 하려고 하자 응. 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재촉하였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대답하다 말고 자신의 목을 바라보며 표정을 더욱 험학히하자 기분이 나빠져 째려봣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먼저 했잖아."
라고 하지만 일단 한 번 쯤은 아량을 배풀어야겟다 싶어서 자기가 자라온 숲 방향을 손으로 가리킨다. 그 자신은 모르겟지만 거긴 예전부터 죄수를 사형시킬때 다른 수임들이 사형수 노릇을 꺼려해서 그 대신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 하는, 이 근방에서 가장 흉포하고 끔직한 마수들이 드글대는 마물의 숲이라고 불리는 장소였다. 살아돌아온 자는 없지만, 간혹 그리로 보낸 죄수의 뼈와 찢겨진 옷의 잔해가 나오는... 그러던중 그는 토끼수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말한다.
"우리엄마도 그 비슷한거 갖고있었는데. 그거 또 있어? 몇년전에 잊어버려서 다시 갖고싶어. 또 있으면 나 줘."
토끼수인이 협박조로 말하는데도 겁을 하나 먹지 않고 말하며 손을 뻗는다. -
157 마왕 재수생 이야기 입디다 (27217E+53) 2016. 6. 29. 오전 1:19:17"아..안녕ㅎ! ...네!네!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해주세요 공주님 자..잠깐!
아 로즈마리 티도 있으니 일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하죠"
뭐...옛날옛적에 공주님이 이하생략 마왕이 납치 이하생략 같은 느낌으로 네...제가 완전 나쁜놈이죠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왕고시는 합격하려면 ...실기시험으로 공주를 1년간 납치한단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나도 싫다구요! 우리집에 남이 있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근데 어쩌겠어요 이것도 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쩔수없는 일인걸...
여튼 혼자 자결,자해 한다던가 그러면 실기점수가 까이니 공주를 설득부터해보도록합니다
"뭐...그렇게 된 일입니다 공주님...딱 1년만 버텨주세요
그렇게 때되면 온 용사한테 죽는 쉬늉이나 오지 않는다면 저희쪽에서 여러 별장이나 휴양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장소를 제공해드릴테니까요
이게...매번 실기에 말이 많지만 전통인지라 바뀌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번대 마왕후보생 할론 페일러즈 트리스타
그냥 편할대로 불러주세요 할론이나 마왕...뭐 그런"
일단 좋은 인상을 위해 웃는얼굴을 짓는다
뭐...납치부터 좋은인상이 아니긴하지만...노력하고 있잖아! 얼굴도 인간형으로 그것도 인간들사이에서 미남형이라는 모습으로 바꾸고 웃어주고 차도 주고 살려주고(?)!! -
158 발랄한 분위기로 가려 했다만 내 손을 거치니까... (45842E+52) 2016. 6. 29. 오후 10:21:24>>157
찻잔을 앞에 두고도 입에 담을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잔을 던지지 않는 게 다행인 상황이었지만 말이다. 미묘하게 바뀌는 표정의 의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이 분명했다. 마왕 고시라니 웃기지도 않지. 정신을 잃은 뒤 낯선 장소에 자리 잡기까지의 머릿속이 마냥 백지장이었다면 거짓일 것이다. 행선지의 유추나 이런저런 목적들부터 시작하여 '역시 내가 곱게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날 리가 없지.'라는 마음속 한탄까지. 목숨이라면 내놓을 마음이라면 먹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한 결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아해야 하는 걸까, 어이 없는 이유를 빌미로 싫어해야 하는 걸까. 머리에 가득 들어찬 복잡한 생각들을 한숨으로 내뱉어본다. 한낱 비정규 마왕 따위를 상대로 이런저런 생각이라니, 바보 같은 본인을 타박해본다.
"아리엘 셀레스트 에르미온. 호칭은 어찌 됐든 좋습니다. 납치당한 상황에서 격식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요."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들으며 한 가지 시험해 볼 여지가 있었다. 한낱 합격용 공주의 목숨에는 어떠한 가치가 부여되는가, 나는 이곳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을 것인가. 자해나 자결시 점수가 까인다…라. 입에 대지도 않았던 로즈마리를 최소한의 격식을 차리며 전부 입안에 흘려보낸 뒤 찻잔을 창문에 던지는 기이한 행동을 선보인다. 쨍그랑, 산산조각이 나며 요란한 소리를 내던 근원지가 눈에 띄었다. 성큼성큼 걸음을 재촉한 뒤 가장 위험해 보이는 파편을 들어 올린다. 잔뜩 선 날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본래 공주의 지위라면 그에 걸맞은 대가가 필요했다. 공식과 비공식을 가리지 않는 말투의 제한이나 유년 생활부터 철저히 금기시 되어온 단독 외출이 그 예였다. 하지만 사람은 하지 말라는 행동에 더 마음을 주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언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커튼을 엮어 단단히 묶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던 14살의 가을. 그때에 빈민가에서 들려온 남학생들의 거친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나중에 나도 말해봐야지'라는 기약 없는 다짐을 이어나갔던 추억이 나름 존재하였다. 그 말을 내가 할 일이 올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 없었지만.
"엿먹어요, 마왕 후보생님."
송골송골 손목에 맺힌 핏방울만을 바라보았다. 조금 쓰라린 것을 보니 꿈은 아닌가. 또랑또랑한 눈을 치켜뜨고 눈앞의 남자를 바라본다. 어때요, 예비 마왕님. 절 죽일래요? -
159 이름 없음 (34198E+54) 2016. 6. 30. 오전 1:41:47어쩌다보니 무척이나 공손해지는 자세
그도그럴게 ...기센여자는 무섭단말이지 옆왕국의 공주님을 데려왔어야...아니아니 그쪽은 너무 어려서 무서워할거고 아랫왕국은 아들만 셋 윗왕국은 환자라서 안되고 ...딱히 대안이 없었던거구나
" ..그..그럼 아리엘 공주님으ㄹ..으으아"
쨍하는 소리와함께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다
잠깐 벙쪄하는 마왕님의 표정 하지만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아쉽게도 금방 마왕의 손에 저지되었다
실기를 이제껏 실패해서 그렇지 이론과 흑마법 시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한손으로 간단히 공주를 마력으로 들어올린뒤
나머지 한손으로 그녀의 손에 쥐어진 조각까지 합하여 유리조각을 한데 모으더니 금방 창문을 복구시킨다
"어쩜...손목이"
들어올린 공주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살펴보곤 핏방울에 마왕은 인상을 찌푸린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깊은 상처아니야
이렇게 베인상처는 신성계열이 아닌 간단한 흑주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자해의 감점은 다행히 일년에 두번 다녀가는 실기 감독관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되니까
"음...찻잔은...뭐 괜찮아요 이상황에서 당신보다 중요한건 없으니까요" -
160 이름 없음 (78189E+45) 2016. 6. 30. 오전 8:48:14>>159
허무하리만큼 빠르게 들려지는 몸. 당연한 이야기지만 살면서 날아보았던 기회는 전무한, 평범한 공주에 불과하였다. 무미건조하였던 눈빛에 생기가 감돌았다. 왜 잊고 있었을까? 마녀의 '마'도 마왕의 '마'도 같은 능력을 지칭한다는 것을. 후보생이라는 말이 귓가에 들려왔을 적엔 마력이 적을 거라 추측했지만, 이쪽 동네는 태생부터 가지는 옵션인 것 같다. 나도 마족으로 태어날 걸 그랬나.
"마법 쓸 수 있는거예요? 얼마나요? 짠, 하고 대형 인형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손짓이 가해지자 빠른 속도로 일들이 원상복귀 된다. 믿기 힘든 광경이다. 놀라워하는 표정을 숨기려는 시도는 굳이 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내려가 품에 안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포근해서, 뻣뻣한 몸의 힘을 풀고 눈을 느리게 감았다가 떠본다. 손목에서 새어나온 핏줄기가 마왕의 옷에 닿았을까? 몇 초 지나지 않았음에도 손목을 괴롭히던 쓰라림이 사라진 것을 느껴 손목을 나직히 바라본다.
"그건 1년을 위한 단기 감정인 건가요?"
공주라는 지위에서 살아가며 가장 많이 바라왔던 요소는 인정이었다. 빈말이라도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는데. 시험의 실험체로 납치되어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
161 이름 없음 (34198E+54) 2016. 6. 30. 오후 9:57:54"공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괄량이가 마법의 등장에 이리도 쉽게 매료될지 몰랐던지라 오히려 이쪽에서 당황해버리고
신기해하는 반응에 금세 사람만한 곰인형도 만들어낸다
"이럼 만족하셨을까요?"
이런것으로 고분고분해지면 좋겠지만 ....
하지만 다음으로 꽤나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공주
"그건...공주님하기에 달렸겠지요
그 단기 감정은 깊은 감정이 되기에 충분한 도화선이지 않니까요"
확실히 이런 인도적?납치이후의 마왕과 공주와의 관계는 다양한 케이스가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좋은 친구 사이,드물기는 하지만 어쩌면 반려의 관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은 우습게 볼것이 아니라 관계를 쌓기엔 충분한 시간인것이니까
"뭐 그럴려면 공주님의 협력도 필요하니 될수있는한 이 방안에서 나가려고하지 말아주세요
시종을 붙여드릴테니 필요한건 그들에게 부탁하도록하세요 아 물론 절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름 공주님은 특별한 손님이시니까요"
결국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방문을 나서는 마왕
어쨌든 시험때문에 공무를 망칠수는 없으니
공주의 편의와 감시를 위해 시종을 남기고 사라진다 -
162 이름 없음 (78472E+53) 2016. 6. 30. 오후 11:58:08>>161
마왕 후보생이라는 애매한 지위의 마력 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던져볼 생각이었지만,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물건을 읊는다는 것이 대형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연신 자신을 지탄한다. 순간이동이라던지 도청, 독심술 같은 요소의 마법들을 잔뜩 말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해보아도 이미 귀엽게 태어나버린 곰인형을 어설픈 자세로 안아든다. 귓가에 들려오는 말을 되새겨보며. 깊은 감정의 도화선…이라. 마왕과 친우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걸까. 협정을 함께 하는 자리, 여왕과 마왕이 함께 하는 세계 정복까지. 함께 세계를 짓밟는 미래까지 상상이 닿았을 때는 이미 눈앞의 마왕, 호칭을 정리하자면 할론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끝마칠 즈음이었다. 적당히 넘겨들으며 고개를 몇 번 끄덕인다.
기품, 얌전함과는 거리가 먼 성격으로 태어났을 때엔 조금 더 고상한 마음씨와 행동 가지들을, 감정을 숨지고 내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그 속에서도 단 하나.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였다. 말이 좋아 외출이지, 적어도 5명 이내의 시종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미 취미가 아닌 왕궁 행사로 변질되어 있었고 홀로 성 밖에 발을 들인 뒤 들키는 날이면 방 안에 감금되다시피하였다. 그런 삶은 그다지 달콤한 것은 아니었으니. 그런 본인에게 나가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찰리 만무했다. 방 안에 틀어박히는 삶은 이미 지겹도록 되풀이되었는데 말이죠.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푸흐, 실소를 지어 보인다.
"아무래도 생전 처음 방문한 공간인 만큼 피곤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조금 취침을 청할까 하는데, 본디 예민한 성향인 터라 근처에 시종이 있다면 깊은 잠에는 무리가 있기에.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기껏 남겨진 시종을 쏘아붙이며 방 밖으로 내보내길 시도한다. 결국 문이 닫히는 비명이 방 안을 울린다. 이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외부와의 통로가 열림과 동시에 서늘한 바람이 머릿결을 쓸어내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실 여유도 없이 창밖에 한 발을 내딛는다. 그러고 보니 여기 몇 층이더라? 본인에게 내건 질문이었지만, 일단 납치를 당한 상황이기에 이 방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알리 만무했다. 인형이 푹신하면 됐지.
짧은 시간 안에 탈출하기 계획이란, 키로 보나 두께로 보나 자신보다 조금 큰 인형을 등 뒤에 매달고 뒤로 뛰어내린다면 심한 고통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린 것이었다. 아프면 마법으로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건방진 생각도 조금 합쳐서. 곰인형을 등에이고 창문 밖의 풍경을 등지는 모습은 이상하기 짝이 없었지만, 왼발과 오른발이 연이어 창틀에서 멀어지며 공중에 떠오른 상태가 되었을 때는 마치 번지점프라는 유희 같은 모습에 가슴이 조금은 두근거렸다. 이 상황에도 죽음이나 고통에 대한 공포는 없어서,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은 어딘가 결여된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조금은 밀려왔지만 말이다. -
163 이름 없음 (99215E+56) 2016. 7. 1. 오후 4:53:28웅성거리는 회의실 안
마왕은 조금 곤란한 얼굴로 앉아 있다
설마 내가 나가자 마자 시종들을 내보내고 저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줄이야
해봐야 커튼으로 줄이라도 꼬아 내려갈줄알았지 ...발에 안보이는 족쇄라도 채워놔서 다행이다
아마 번지점프를 하자마자 창문밖에 대롱대롱 매달려선 성벽에 코라도 깨졌겠지 그걸로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좋겠다만...
일단 벌로 한동안 그렇게 놔둘까 싶다
앞으로의 생활의 걱정과 함께 그녀의 전 시종들이 문득 불쌍해진다
역시 입과 몸을 꽁꽁 묶어서 방 한켠에 보관을 할껄 그랬나보다싶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생명을 그런식으로 취급하자니 ...마왕주제에 조금 양심의 가책이 드니 그냥 이대로 방목하는수 없나 싶다
"응? 아니야 ..난 2번째 방법이 좋을것같은데"
주변 간부들의 걱정스런소리에 다시 회의로 돌아왔지만
얼마 안가 집중이 안돼,차라리 빨리 결정해버리고 이 회의를 끝내버리는게 나은것같다 -
164 이름 없음 (0904E+57) 2016. 7. 3. 오전 12:05:24ㄱㅅ
-
165 선후배 이야기 (65866E+53) 2016. 7. 3. 오전 12:53:31"능소화가 좋으신가봐요."
그림속에서 능소화가 무너진 벽을 타 올라가고 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묻는다.
사실 묻기보다 따지는 것에 가깝다. 당신은 왜 늘 이런 그림만 그려? 직접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물었다가는 상처입은 그와 싸우고 다시는 상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미술실에 드나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만. 벌써 이주째 점심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
동아리실밖에 없는, 심지어 사람도 얼마없는 구관건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가 있으니 혼자는 아니다.
다만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그와 있는 것이니 혼자있는 것과 별다른 차이도 없다.
침묵을 곱씹는 것에 지쳐 그에게 말을 건다.
//bl/ hl 둘 다 되니까 마음대로 말 걸어줘! -
166 이름 없음 (15792E+52) 2016. 7. 3. 오후 5:19:06인야앙
-
167 이름 없음 (29073E+60) 2016. 7. 4. 오후 6:29:03"손님을 모시게된 p라 하옵니다 모쪼록 잘부탁드립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침상에서 남자를 맞이하는 한사람
몸의선도 가늘고 목소리를 최대한 여성스럽게 한다고는 했지만 기모노가 감싼 덩치라거나 뚜렷하게 들어난 목젓이라던가가
그의 성별을 금방이고 알게해준다
"어라? 실망하신 얼굴인것 같군요 하긴 침소에서 남자가 기다린다하면 보통은"
순식간에 품속의 기모노 사이에서 장검을 꺼내드는 여장남자
칼의 서늘함이 들어온 남자의 목을 감싼다
"이런일 뿐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남기실말은?" -
168 이름 없음 (82169E+57) 2016. 7. 4. 오후 9:19:13>>167
"...그래. 역시 이런일 뿐이겟지."
기모노를 아래로 드러나는 선을 보면서 저도모르게 이건 이것대로 라는 생각을 하던 그 남자는 목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약한 핏줄기와 향을 코로 들이마쉰다. 내 피냄새를 맡는것도 오랜만이라 생각한다. 남자를 발로 차서 떨어뜨려야 할까 아니면... 아. 지루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게 확실한데 그냥 이 사실도 흥미가 가지 않을만큼 지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다.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장남자의 얼굴을 편안히 직시하며 말한다.
"마지막 말은 좀 아껴두고 싶지만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만 알려준다면야 어쩌든지 좋아. 넌..."
문득 창틈으로 들어오는 달빛과 방 안의 향냄새에 살짝 고개를 찌푸렸다.
"누군가의 사주로 온 자객이냐, 아니면 나에게 원한이 있는 자이냐."
어차피 남의 얼굴을 외우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해줘봤자 떠오를리 없겟다고 생각하지만 물어보았다. -
169 이름 없음 (29073E+60) 2016. 7. 4. 오후 9:53:35"흐하아아하 둘다 아니야 난 자객도 너에게 원한도 없는 완벽한 남인걸"
뒤로 넘어갈듯이 웃어재껴도 칼을 거두지 않은채 이야기를 이어간다
"다만 오늘 널 모시기로한 여자와 조금 관계가 있어서 ...흔히 있는 이야기지
팔려갈 여자의 이루어질수없는 사랑 ...도망
난 그여자도 모르는 좌부동이라고나 할까?"
바닥에 준비되어있던 청주를 들어올려 마신뒤 친절하게도 나머지는 남자의 입에도 흘려보네준다
"그런데 도망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벌고있는중이야 네가 지금 나가지만 않는다면 내일 이슬이 식을때까지는 추적하지 않을테니
나야 뭐...어짜피 저번에 죽을목숨이였으니 은혜를 갚고 죽어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의외로 나한테 기모노가 어울린다는 사실도 알았고" -
170 이름 없음 (97687E+49) 2016. 7. 6. 오전 8:15:01뿌뿌뿌
-
171 이름 없음 (54872E+54) 2016. 7. 7. 오후 9:25:08빱
-
172 이름 없음 (33823E+57) 2016. 7. 23. 오전 2:29:15ㄱㅅ
-
173 이름 없음 (10569E+56) 2016. 7. 25. 오후 11:36:39"잠깐,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외치자마자 당신이 상자를 연다. 여자는 당황하여 그것을 덥썩 닫아버리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온갖 뼈들은 이미 보인지 오래다.
부모님의 뼈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흐른다. 원은 늘 그렇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아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오컬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에요?"
그렇게 말한다. -
174 이름 없음 (01706E+59) 2016. 7. 26. 오전 12:06:00"....으응? 네? 아..아니 그냥 좀 놀라서"
상자에 들어있는 뼛조각들
섬짓하게 보이기도 하는게 찐득한 더위속에서도 희의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아난다
"원,당신이라면 그어떤 사람이라도 전 좋아할만한 이유가 되요
그래도 저 플라스틱은 내눈에 안띄는곳에 치워두도록 하죠
전 할로윈 코스튬도 무서워하거든요"
상자를 내려두고 그에게로 달려가 안긴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애써 이 불안을 내려놓을수 없을것같았다
그의 온기가 나의 뺨에 닿는 순간만이 이 느낌을 녹여주겠지
"앞으로는 이런거 숨기지 말아요 ...같이 맞추어갈테니까"
근데 숨기지 말라? 내가 이런말을 해도 되는걸까 -
175 이름 없음 (20048E+55) 2016. 7. 26. 오전 1:51:29>>174
희가 놀란 것을 바라보며 원은 피가 식는 것만 같다. 겉으론 놀란 희를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짓고선,
분명히 치워두었던 물건이 대체 어디서 기어나온 것일까, 머리를 굴린다.
"그래요, 저런 건 치워둬요. 저도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좋지만...절 두려워할까 걱정했어요. 겁이 많군요, 희는.."
그렇다면 더더욱 숨길 수밖에 없다. 원은 희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을 조금 후회하지만
금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애써 생각을 바꾼다. 품 안에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안겨있는 희에게서 불안감과 온기가 함께 전해져온다. 원은 그녀를 다정히 안으며 다독인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론 뭐든지 말할게요."
거짓말이다.
희를 속일 궁리만 하는 것이 원이다. -
176 이름 없음 (01706E+59) 2016. 7. 26. 오전 2:43:28" ...네..."
허공으로 맥없이 울리는 그녀의 동의,사실은 알고있다
그의 모든말이 거짓이라는것...하지만 따뜻해져 오는 이 온기를 희는 거부할 능력이 되지못한다
두사람의 무언의 동의에 그 뼛조각의 진실은 금방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린다
"원! 밖을 봐...아름다워요
잠시의 침묵후 그것을 깬것은 희였다
창으로 고개를 돌린뒤 뉘엿뉘엿 언덕을 넘어 집으로 가는 붉은 태양씨를 가리킨다
우연히 찾은 소재치고는 주홍색 구름들과 타들어가는 노을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
"아버지가 마침 이집을 내어주셔서 잘됬네요
이렇게 당신과 이 장면을 매일볼수있다니"
부유한 가정인 희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집한채를 내놓는것이 그리 어려운일은 아닐테지
그럼 원한다면 다른 회사를 기반부터 망가뜨릴수도 있으니까 -
177 이름 없음 (67463E+58) 2016. 9. 4. 오후 6:58:26ㄱㅅ
-
178 이름 없음 (04136E+45) 2016. 11. 7. 오전 12:50:51내가 잠들어 있던 어느날 이 세상은 망해버렸습니다.
아빠위 딸인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나는 아무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날 수면 냉동기에 넣은 날로부터 대략 십 몇년이 지나, 나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들어갔던 그대로의 모습에서 자라지 않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때 반파된 건물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풀 한포기도 나지 않은 회색의 도시와 풍화되어 낡아가는것이 보이는 동물과 사람의 뼈들로 이뤄진 무척이나 낡고 허름한 풍경이였습니다. 내 발밑에는, 아버지의 가운과 명찰을 갖고있는 해골이 업드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정처없이 걷기만 하였습니다.
줄곳, 걷고, 걷는, 그런 일상의 반복끝에 다리와 발이 상처와 굳은살 투성이가 되어서 걷는것도 어려워졌을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거지만, 무척 기뻐요."
/////////
....이런 느낌으로 이을 사람 있어? 멸망한 세상에 남은 두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써봤는데.. -
179 이름 없음 (2028482E+4) 2017. 12. 31. 오후 1:35:04갱신해둘게!
-
180 소녀주◆88ngGvOK7o (3183093E+5) 2017. 12. 31. 오후 10:55:21못 만날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만나서 진짜 좋다 ㅠㅜㅠ 대공주 이리로 와줘! 나도 제목이랑 글귀 생각하고 있을게. 참참 시트 양식은
이름:
성별:
나이:
외관:
성격:
기타:
이걸로 서로 짜오면 되려나? -
181 소녀주◆88ngGvOK7o (6559379E+6) 2018. 1. 1. 오전 2:21:10대공주는 자러 간 모양이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갱신 해둘게!
-
182 이름 없음 (7271707E+5) 2018. 1. 1. 오전 2:24:58나는 일단 보트를 만들고 시트도 그안에서 대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혹시 만들어줄수있을까? 제목하고 글귀는 내가 고를줄 몰라서.. -
183 이름 없음 (7271707E+5) 2018. 1. 1. 오전 2:26:07>>182 +>>180 으아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소녀주도 해피뉴이어!
-
184 소녀주◆88ngGvOK7o (6559379E+6) 2018. 1. 1. 오전 2:27:53>>182 대공주야..? 내가 고른 제목이나 글귀로라도 괜찮다면 만들도록 할게! 기다려줘!! 안잤구낭
-
185 이름 없음 (7271707E+5) 2018. 1. 1. 오전 2:31:09>>184기다릴께!
-
186 이름 없음 (1719899E+6) 2018. 1. 1. 오후 6:12:32소녀는 나비를 톡톡 만진다. 그러자 나비가 흐드륵 떨더니 이내 다시 날라다닌다. 소녀는 그것을 신기하다는듯이 멍때리며 본다. 고개를 휘휘 젓기도 하면서, 결의의 얼굴로 다시 나비를 톡톡 만져댄다.
"...감촉, 나비의 감촉."
이내 다시 자신의 손을 만져보더니 앙, 하며 깨문다. 깨문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러나온다.소녀는 아파하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마찬가지로 나비를 뜻하는 감촉이라도 느낀 양 다시 얼굴을 핀다.
소녀는 쓰윽 고개를 돌려 당신을 바라본다. 소녀는 씨익 웃으더니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당신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나비 감촉, 그게 정말로 신기해요. 부드럽지만, 으으음.. 애매한 그런 느낌?" -
187 이름 없음 (9331567E+5) 2018. 1. 13. 오전 3:45:08러브로이드,교감형로봇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된 로봇
처음에는 세상이 말세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딱히 관심은 없었다.
그때는 연애도 했었고 그렇게 필요성을 찾지못했으니까.
그런데...
"야! 이 미@ 이게 뭐야 당장 안가져가?"
연인과 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찾아온 내 생일
친구에게 선물로 그것을 받게되었다.
그것도 전애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헤어진 애인과 똑같은 로봇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구차하고 찌질해보일까!
친구에게 전화로 소리도 쳐보고 혼자서 당장이라도 폐기하려해보지만 차마 저 얼굴을 내손으로 폐기는 못할것같아 다시 집어넣으려는 찰나
"일단 다시 넣어...어어?"
의도와는 다르게 스위치라도 실수로 누른건지 로봇의 눈꺼풀이 서서히 일어난다. -
188 이름 없음 (5902163E+6) 2018. 1. 13. 오전 3:55:29>>187
로봇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눈꺼풀과 피부, 서서히 뜨여진 눈꺼풀 뒤로 한때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눈동자가 보인다.
물론, 그 눈동자에는 사랑 대신 공허한 무언가만이 남겨져있지만.
“ 프로그램 구동 시작합니다. ••• “
자그마한 입술이 떼어지고 딱딱한 기계음이 흘러나온다. 눈꺼풀은 살포시 감기더니, 다시 한 번 천천히 그 눈동자를 드러낸다.
“ 안녕하세요? “
한 때 당신을 미친 듯 사랑했던, 하지만 결국에는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돌아선 그 사람의 얼굴로 당신에게 인사를 건넨다. 분명 사랑한다는 한 마디가 수 없이 오갔을 입술에서는 감정따위 실리지 않은 차가운 한 마디가 흘러나온다.
로봇의 얼굴은 웃고있지만, 역시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리 없었다.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지었을 얼굴이 당신을 마주하고 있다. -
189 이름 없음 (9331567E+5) 2018. 1. 13. 오전 4:31:18듣기 좋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다시는 이렇게 가까이서들을줄은 몰랐던 그 목소리
분노에 차있던 그눈은 이제 텅 비어있고 목소리는 차분해져있는게 그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주는것같다
"아 안녕...하세요"
초면인것을 고려하여 인사해보지만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얼어죽을 마지막을 그렇게 떠나놓고! 하지만 그 외침은 가슴 깊은곳에서 메아리치기만 할뿐 입밖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 로봇이 무슨죄라고 최신식은 스스로 생각도 할줄 안다던데 그렇게되면 미안하잖아.
"하하 하"
역시 저얼굴을 계속 쳐다보는것은 고역이다.
저 감정없는 눈동자가 꼭 이게 무슨 짓이냐며 자신을 꾸짓는것같아 더욱 그렇다.
눈은 아래를 향해서 몸을 밀어 그것을 다시 상자안으로 집어넣으려 노력한다
'들어가라 좀!!' -
190 이름 없음 (5902163E+6) 2018. 1. 13. 오전 4:52:06로봇은 당신의 당황스러운 듯 어색한 인사에 생긋 미소를 지어보인다.
정교히 만들어진 로봇의 미소는 언뜻 본다면 그 감정까지 느껴질 지도 모를 정도였다. 물론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거짓 된 가면이란 것을 눈치 챌 수 있겠지만. 오직 당신을 위해 미소짓던 그는 더이상 없었다. 그를 따라하는 모조품만이 당신을 위해 미소지을 뿐. 당신을 담은 눈동자는 당신의 눈동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 저를 폐기하려 하시는 건가요? “
당연하게도, 스스로 생각해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그저 프로그래밍 된 수 많은 문장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당신의 추억이 젖은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결국에 몸을 펴고 일어난 로봇은 당신이 담긴 눈동자로 당신을 바라본다.
“ 조금만 더, 같이 있는 건 어떨까요. “
어쩐지 애처롭게 느껴지는 목소리는, 당신의 추억을 자극할 지도 모르겠다.
고작 로봇의 인공두뇌에서 흘러나오는 문장이었지만, 어쩐지 버림 받기를 원치 않는 감정이 실려있는 것만 같다. 인간의 피부와 같은 촉감에 인간의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어진 로봇의 손이 당신의 손을 감싼다. -
191 이름 없음 (9331567E+5) 2018. 1. 13. 오후 11:54:07>>190
"아니 그게.."
단순히 겉모습만 닮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되뇌어도 차마 그 손을 쉽게 뿌리칠수없었고 그런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다 느낀다.
그런말은 반칙이다.
밤하늘을 비추던 커다란 거울같던 호수에서 햇빛의 부스러기가 흩뿌려지던 침대에서 둘의 추억을 뒤집어 헤치는듯한 그 문장에 부정의 말은 산산히 부서지고 새로운 문장이 재조립되던 순간
-띠리리
다행히 울려오는 전화소리,
그덕에 그 상황을 탈출해 이것을 보내온 친구에게 본인의 창피함을 분노로 변환해 표출한다.
내일에나 반품이 된다니..마음을 강하게 먹자 다시는 방금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었다시피 반품할꺼야 폐기는 아니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
192 이름 없음 (4886059E+5) 2018. 1. 14. 오전 12:06:56로봇의 눈동자는 당신을 향한다. 진심 대신 당신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눈동자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러 왔건만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이 퍽 우습기도 하였다. 로봇은 물끄러미 당신의 눈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그 고개를 떨구어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어버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곧 버림 받을 처지가 될 것이란 걸. 분명하게, 그는 느끼고 있었다. 사람도 아닌 주제에 말이지.
순간 들려오는 벨소리에 로봇의 시선이 움직인다. 전화를 받는 당신에게로 옮겨진 눈동자에는 여전히 당신이 담겨있다.
“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흐릿히 피어오른 미소가 당신을 향한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계라는 위화감 조차 들지 않는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있었다. 당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버린 그 때와는 다르게. 그는 집을 한 번 훑어보더니, 이내 자신이 담겨있던 상자에서 발을 빼내어 당신에게 다가간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마치 저가 다가가선 안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만 같다.
“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당신의 마음에 들었어야 했는데. “
그래야, 사랑을 받으니까요. -
193 이름 없음 (4896155E+5) 2018. 1. 15. 오후 5:14:44갱신-!!
-
194 이름 없음 (5024755E+6) 2018. 1. 22. 오전 3:09:35갱신~
-
195 이름 없음 (1280908E+6) 2018. 2. 5. 오후 11:16:36갱신
-
196 이름 없음 (1463915E+5) 2018. 2. 26. 오후 9:46:42빽빽한 나뭇잎으로 햇빛조차 들지않는 어두운 숲속
밤하늘의 한구석을 뜯어낸듯 반짝거리는 남색로브를 흩날리며 아이옆으로 다가왔다
푹 눌러쓴 로브로 자세히는 안보이지만 가까이서 본 여인은 피부는 죽은 이만큼 창백했고 미소는 설탕처럼 달콤했다
"네가 날 부른거구나?"
언뜻 루비같은 붉은 안광이 로브밑으로 반짝였다
"대가는 너의 영혼,계약을 하자꾸나 자! 무엇을 원하니?" -
197 이름 없음 (1463915E+5) 2018. 2. 26. 오후 11:47:57>>196으로 기다리고있어
-
198 이름 없음 (6978305E+6) 2018. 2. 26. 오후 11:53:35>>196
"응. 내가 널 불렀어."
소녀는 여자의 피부만큼이나 생기가 없고, 생물이라는 것에 대한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당신을 비라보며, 그 달콤한 미소를 보면서도 뇌의 어딘가가 망가진 것 처럼 미동이 없었다. 그냥 자신이 소환한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강하고 잔인한 악마이길 바랄뿐이다.
"좋아. 계약해.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겟어. 네 능력은 어디까지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갖고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야?"
소녀는 어둡고 습한 숲 안에서, 이런 숲에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끔직한 족쇠에 달린 그대로 피부의 짓물을 대충 닦아내며 가만히 바라본다. -
199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12:22:12"질문이 많은 꼬마구나 싫지않아"
여인은 꺄르르웃으며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확실히 인간인것같지 않은 행동
망가진 눈동자가 골동품의 생채기처럼 여인의 관심을 끌어낸다
"둘다 가능해 목숨을 걸었는데 그정도는 가능해야지!
죽은이와 춤도 추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왕이라도 죽이고~"
검던 손가락이 반짝거리더니 여인은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인간의 형체로 만들어 같이 춤을 추고 까마귀들이 나무인간에게 붉은 열매로 장식된 왕관을 씌어주자 다시 나무토막으로 돌아가 흩어진다.
"우리 아가씨는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런걸 물어보나?"
바닥에 떨어진 열매왕관을 아이에게 씌어준다. -
200 이름 없음 (8225285E+5) 2018. 2. 27. 오전 1:11:51>>199
의심하고 싶은 말이지만 일단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이 만든 나무인간이며 까마귀를 바라보다가, 열매 왕관이 피가 딱딱하게 굳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쓰여지자 눈을 깜박였다. 그것에 맞추어 방금 누군가의 살갖 밖으로 나오는 핏방울 처럼 빨간색의 열매가 또르륵 하고 하나 떨어진다.
"내 언니, 아샤를 살려줘. 하지만 아샤만을 살리면 아샤언니는 또 저 산 밑의 마을사람들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마녀로 태워질거야. 그러니까, 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저 밑의 마을 사람들 전부의 죽음과 아샤 나인의 부활을 원해. 만약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땐 두말없이 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에 타죽었으면 좋겟어."
피가 진득하고 어딘가 그을린 냄새를 풍기는 여자아이, 발목을 너무 꽉 옭아매서 발과 발목이 전부 보랏빛으로 변한 족쇄에 메여있는 그 소녀는 그녀는 자신이 소환한 이 여악마 만큼이나 기이하였다. 몸을 보아도, 목소리를 들어도 소녀는 이미 숨이 끊어졌거나 곧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지만 눈만큼은 증오를 태워서 생명의 불꽃이 타는 것 처럼 증오가 가득 차서 생생하였다. -
201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1:43:05"..좋아 꼬맹이주제에 대담하네 꽤나 힘좀 쓰겠는걸"
악마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숨을 불어넣자 자그마한 불씨들이 그 안에서 나와 마을 방향으로 날아간다
다음으로 품안에서 은거울을 꺼내 소녀에게 보여준다
불타가는 집안에서 어린 아기를 잡고 신을 찾는 여인 아무이유없이 부모를 하루아침에 잃은 아이들 신체의 일부가 타버려 앞으로 삶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음 소원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기억이.. 아!"
소녀의 검붉게 변한다리는 다시 통통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했고 진득하고 더러운 피들은 다시 액체처럼 허공에 모였다 여인의 손안에 모였다 주먹을 쥐자 금세 눈녹듯 사라져버린다
"소원은 이제 끝이야 다음은 댓가지"
여인의 금장이 달린 보랏빛 하이힐이 바닥을 쿵하고 짚자 아샤 나인 이라는 금화가 나타난다
"오해가 있나본데 날 부른건 너가 아니란다 바로 이녀석이지"
금화의 선명한 아샤나인의 필기체를 보여준다
"꼬마야 아직도 거기있니? 북쪽으로 가면있는 마차에 타거라 널 부잣집 양녀로 받아드려줄꺼야 거기딸이 방금 죽었거든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지 고민좀 해봐야겠구나 비싸게 산만큼 잘써야하거든" -
202 이름 없음 (6750348E+5) 2018. 2. 27. 오전 1:48:32갱신~ 돌리고싶은데 누가 안올려 주려나
-
203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1:52:06>>202마녀와 소년으로 돌려볼래?
-
204 이름 없음 (1167335E+5) 2018. 2. 27. 오전 2:02:05>>202 헉...! 상상도 못 한 전개였어!! 이렇게 될줄이야....
-
205 이름 없음 (6750348E+5) 2018. 2. 27. 오전 2:14:15>>203 좋아! 남캐러야 여캐러야? 내쪽은 여캐러!
-
206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2:18:55>>204 혹시 소녀주니? 앵커가 202로되어있어서 아님 말구
>>205 난 둘다상관없어 그럼 내가 소년이네 선레 내가쓸까? -
207 이름 없음 (9443884E+5) 2018. 2. 27. 오전 2:34:03>>206 엇 앵커미스 되어버렸네... 맞아! 소녀주야. 짧은 시간이였지만 재미있게 돌릴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
-
208 이름 없음 (6750348E+5) 2018. 2. 27. 오전 2:40:00>>206 앗 부탁할게!! 선레 써줄수있을까!
-
209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2:40:53>>207소녀는 자신이 죽인 딸의 부모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악마는 언니를 지옥불에 지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도 짧지만 즐거웠어! -
210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전 2:45:23"마녀님 일어나셔야죠"
남자는 침대의 여인의 아침을 은은한 허브티향으로 준비한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자 자신도 침대 끝에 앉아 트레인엔 먹음직한 샌드위치를 올려 가져간다
"안 일어나며 제가 다 먹을지도 몰라요" -
211 이름 없음 (6750348E+5) 2018. 2. 27. 오전 3:00:45"....으응"
낮게 신음을 내뱉으며 나른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상체를 들어올려 가볍게 앉고서는 하얀 이불 자락 사이에 스며드는 햇빛을 만끽 하고서는 부드럽게 소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서는 마치 은은히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냥 보드라운 미소를 내지었다. 허브티를 두손 가득 쥐자 느껴지는 열기는 애정과 함께 날아갈것만 같아 꼭 붙들고서는 먹음직스럽게 올려진 샌드위치를 응시했다.
"날 위해 아침 식사까지 만들어준거니 아침 일찍 깨어나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을텐데 말이야"
애정 넘치는 눈빛으로 응시한 여성은 샌드위치를 한 입 가득 베어물었다. -
212 이름 없음 (6750348E+5) 2018. 2. 27. 오후 4:14:11갱신
-
213 이름 없음 (5188571E+5) 2018. 2. 27. 오후 7:01:28자신을 쓰다듬는 손길이 마음에 드는지 자신의 머리를 들이 미는게 더 해달라 어리광부리는듯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배고프면 절 먹을 생각인건가요? 마치 이렇게"
자신을 데려올적 잡아먹기위해 데려왔다는 거짓말을 지금와서까지 믿는것은 아니지만 샌드위치를 쥔 하얀 마녀의 손가락을 살짝 앙 깨문다 -
214 이름 없음 (288181E+62) 2018. 3. 11. 오후 11:20:39새벽 하늘에도 별은 빛났다. 고개를 들기 전에는 알기 힘든 것들. 별빛에 의지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는 별빛과 달빛을 구별하지 못한다. 밤에 고개를 들어본 하늘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는 자는 하늘이면 다 같은 줄 안다.
같은 게 아닌데.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면서 왜들 그래. 깨끗한 별빛은 시릴 정도로 맑았다. 그것이 눈을 파고듬에 눈 안쪽이 아려왔다. 팔을 들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렸다. 암흑이다.
인간을 사랑했다. 그러기에 살기를 바랐다. 그 아름다움이 한철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는 마냥 부러운 존재겠지만, 그것 또한 질리기 시작한다면? 어여쁜 꽃이 가득 피어 있어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일년... 계속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웠는지 조차 잊어버리고, 다른것을 보고 나면 그것에 마음을 줘 버리는. 아름다움이라는건 너무나 짧은 시간동안만 남는것이지 그 이상 가지 못한다. 아름다움이 시들해지면, 노래를 불러서, 춤을 춰서, ...그러다가도 지쳐버리면?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들이다. 이리 애정을 줘서 어쩌려고 그래. 얼굴을 가렸던 팔을 천천히 내리며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길바닥에 널부러진 인영 주변으로 핏물이 웅덩이처럼 고였다. 그 웅덩이에 하나 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야 말라 비틀어진 목소리가 가늘게 떨어졌다.
왜 그래요.
허망하게 잠긴 눈에 물기가 가득 차올랐다. 머잖아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 틈에서 핏물에 잠겨 미동없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대체 왜 그러는거야. 왜 포기하는거야. 힘없이 풀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았다. 등 뒤로 축 늘어진 하얀 날개가 빗물에 흠뻑 젖어서 더는 날 수 없을 것만 같다. 어디선가 저를 비웃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끊임없는 사랑과 희망을 줘도 계속해서 자살하는 인간을 보며 절망하는 천사와, 그런 천사를 암흑으로 끌어내리려는 악마로 짧게 돌려보고 싶다! 성향은 BL이면 좋겠구 끌어내린다는 건 악마가 가지려고하는 독점욕이어도 좋구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려는 것도 상관없어 :^) 관심있으면 이어줘~ -
215 이름 없음 (5678709E+5) 2018. 3. 12. 오전 9:50:33갱신
-
216 이름 없음 (4898175E+5) 2018. 3. 13. 오후 7:09:52갱신
-
217 이름 없음 (3616828E+5) 2018. 4. 9. 오전 11:30:45어째서 이런 몸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언젠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오늘도 죽고 죽고 또 죽는다.
"...아, 못 죽었어. 젠장."
달조차 보이지 않는 한밤중. 인적 드문 폐허에서 총 소리가 울린 것은 수 분 전의 일이었다. 낮에조차 사람이 찾지 않는 뒤숭숭한 그 곳은 자살 명소로는 유명한 곳이어서, 지나가다 누가 들었다면 또 누가 죽었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총소리가 울리고 십여분이 지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쉽게 흘러나왔다. 20대쯤 되어보이는 여성의 목소리. 목소리의 주인은 아쉽다는 듯 혀를 차곤 방금 전까지 뒹굴던 폐건물의 바닥에서 일어났다. 바닥에는 여성의 것으로 추측되는 피가 한바가지 뿌려져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상처 하나 없었다. 머리와 가슴팍에 피가 묻어있기는 했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도 지겹다니까. 옷만 더럽히고 죽지도 못 하고."
아쉬움의 중얼거림은 곧 짜증의 투덜거림으로 바뀌었다. 귀찮네 정말.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저기 어딘가에 있던 가방을 가져왔다.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물건인 듯 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큰 생수통을 꺼내더니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부었다. 그걸로 대강 세수까지 하더니 이번엔 수건을 꺼내어 닦는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했다. 머리 정리를 마치자 옷을 갈아입으려는 듯 피범벅이 된 옷-원피스를 휙 벗어 던졌는데, 그 때마침이랄까 딱 그 순간이라고 할까. 그녀가 있던 방의 입구 쪽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려왔다.
"? 뭐야, 거기 누구 있어?"
걸치고 있던 한겹을 벗어던진 덕에 민망한 모습임에도 그녀는 당당하게 한 손을 허리에 짚고 입구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수치심 같은 것보다 거기에 누가 있는지 왜 있는지 언제부터 봤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듯 했다.
"좋게 말로 할 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해치지는 않을 테니까."
핏물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그리고 몸 역시 상당한 나이스 바디였다. 그것을 자랑하듯 어쩌듯 당당하게 서서 숨어있을 누군가가 알아서 나와주길 기다렸다. 안 나온다면- 잡으러 가야겠지?
//죽어도 죽여도 죽지 않는 여자와 기묘한 인연을 맺는 이야기랄까.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 컾링은 NL쪽으로 해서 몇 턴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기다릴게! -
218 이름 없음 (9862336E+5) 2018. 4. 20. 오후 10:31:57어느곳에나 그렇듯 빛이 꺼지지않는 도시에도 법이 비추지 못하는 어두운 장소는 있는법이다 '아담의 펫숍'말이 펫숍이지 현대판 인신매매장이다 얼굴이 반반하면 애완용으로 몸이 좋으면 취미용 무투장으로 팔려나갈 물건들이 목걸이에 얌전히 걸려있고 스태프들은 당일의 경매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여기까지가 언제나의 일상 이제 비일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갑자기 떨어지는 목걸이들 이래서 전자기기들은 믿을게 못된다는거다 처음엔 같이 당황하던 물건들도 한 떡대가 스태프를 공격하자 경매장 뒤는 금방 아비규환이 되버
"구경거리라도 생겼나?"
한손에 핏빛 쇳조각을 쥔 남자가 음습한 얼굴로 상대방을 노려봤다 하지만 호리호리한 그 몸으론 털을 바짝세운 고양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태위태하면서도 축쳐진 눈매 -
219 이름 없음 (9862336E+5) 2018. 4. 20. 오후 10:43:18어느곳에나 그렇듯 빛이 꺼지지않는 도시에도 법이 비추지 못하는 어두운 장소는 있는법이다 '아담의 펫숍'말이 펫숍이지 현대판 인신매매장이다 얼굴이 반반하면 애완용으로 몸이 좋으면 취미용 무투장으로 팔려나갈 물건들이 전기 목걸이에 걸려있고 스태프들은 당일의 경매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여기까지가 언제나의 일상 이제 비일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갑자기 떨어지는 목걸이들 이래서 전자기기들은 믿을게 못된다는거다 처음엔 같이 당황하던 물건들도 한 떡대가 스태프를 공격하자 경매장 뒤는 금방 아비규환이 되버린다 너무 갑작스럽고 눈을 피하기위해 최대한 소규모로 움직여서 일까 그나마 있던 경비들 조차 이 상황을 조치하지 못하고 정신없는 물건들에게 쓰러진다 당신은 정신없이 그 지옥을 헤치며 뛰어다니다 한 남자를 만났다
"구경거리라도 생겼나?"
한손에 핏빛 쇳조각을 쥔 남자가 음습한 얼굴로 상대방을 노려봤다 하지만 호리호리한 그 몸으론 털을 바짝세운 고양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태위태하면서도 반반한 얼굴에 축쳐진 눈매 윗옷은 없고 바지만을 부여잡은 모습 발밑에서 목에 피를 흘리며 널부러진 남자 보지않아도 방금전 상황을 대충 알수있게 해주었다
"멍청히서서 뭐하는거지 탈출하려는거 아니야? 앞장서 카드키를 가진 내가 필요할테니까"
부탁하는 입장치고는 꽤 뻔뻔한 말투이다
::중간 완성은 무시해줘! 호리남과 같이 탈출 할뿐인 글이야 관심있는사람있니? -
220 이름 없음 (4063003E+4) 2018. 4. 21. 오전 3:19:27>>219
언뜻보면 확실하게 애완용이라고 할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열 살 남짓의 꼬마아이였다. 비록 보라색으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부시시해서 아이의 얼굴을 어느정도 가리는데다에서 그치지 않고 뒷목까지 치렁거리며, 건강하지 않은 것 처럼 손톱이 죄다 갈라져 피멍울이 져있고 옷은 정말 낡은 일자형의 무늬도 장식도 없는 가난해 보일뿐인 원피스... 라기보단 거적대기 하나에 맨발일뿐인 꼬마는 당신과 당신이 일으킨 일들을 보고는 표정없이 말하였다.
"그럼 아저씨 일어서요."
그제서야 당신은 이 꼬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꼬마가 그냥 꼬마가 아니라 '여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언뜻보면 당신의 탈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꼬마였다. 당신은 차라리 이 애를 모른척하고 제 갈길을 가는것이 나아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말에 당장 앞장을 서던 꼬마는 당신들을 막아서려는 사람 셋이 나타나자 스스럼없이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해 저 자신의 머리카락같은 '연기' 를 내뿜었다. 그러자, 얼마 안가서 그것에 둘러쌓인 세명이 그대로 자신들의 목을 감싸쥐더니 죽어버리고 목을 간신히 덮던 곱쓸머리는 목을 채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
"아저씨, 그런데 여기서 나가기 전에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몰골을 보며, 방그 사람을 셋이나 죽여놓은 꼬마는 당신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대충 풀자면 꼬마의 정체는 '아담의 펫숍' 으로 건너건너 흘러들어온 실험체! 사실 빈민가에서 인체실험을 목적으로 팔렸는데 그곳이 해체되면서 전투용으로 팔려왔다는 설정이야! -
221 이름 없음 (8713963E+5) 2018. 4. 23. 오전 2:11:51그 기괴한 보라색 광경에도 그는 눈하나 깜밖이지 않는다 비정상속에서 비정상은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기때문일까?
"그러니까 네가 날 보호해야지"
맨몸은 좀 그런지 죽은 이에게서 피묻은 셔츠를 뺏어 입는다 그리곤 꼬맹이에게 보호받는 입장치고는 당당하 모습으로 소녀 뒤에서는 남자
"참고로 카드키는 비밀번호와 함께 넣어야 작동되지 그리고 비밀번호는.."
말과 동시에 그는 쪽지를 삼킨다
"나만 알지 같이 알던 사람이 있긴했는데..방금 죽었잖아"
그의 얼굴에 죄책감은 없어보인다 콰강-끼이익 폭발음과 굉음이 섞여 둘을 귀를 파고든다 아마 아비규환속에서 누군가 전선다발을 건들인 모양이다 지하인 이곳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나갈수없을것이다
"멍청이들! 길은 내가 가르켜주지 멀뚱이 서있지말고 어서 움직여" -
222 이름 없음 (606174E+55) 2018. 5. 22. 오후 7:42:05갱신~
-
223 이름 없음 (283907E+49) 2018. 5. 27. 오전 12:19:52옛날옛적에 한 왕국의 공주님이 나쁜 마왕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왕은 그녀를 구하는자에게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며 용사를 모았습니다
전국각지에서 강하다는 사람은 다 모였고 가장 강했던 용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마왕성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용사는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리고 공주를 구해냅니다
아마 제국으로 향하는 배가 도착하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은 제국은 꽃비가 내리고 사람들도 행복에 잠길것입니다 잘됬다네 잘됬다네
어쨌든 용사가 주인공인 이야기
그외의 인간은 어찌되어도 좋을 이야기
용사파티의 마법사였던 작은 그는 더더욱 어찌되어도 좋아
설령 그가 왕궁 정원사의 아들이였던것도 어려서부터 공주와 친했던 사실도 공주를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사실도 어찌되어도 좋을 이야기
"공주님 어디 불편하신데는 없으신가요?"
똑똑-
밤에는 선실의 문소리가 보다 크게 울려퍼졌다
공주방을 두들이는 이는 정원사의 아들이자 용사파티의 마법사였던 아즐
"멀미마법이 풀렸다면 다시 말해주세요 언제든지 다시 걸어드릴테니까"
그는 공주가 보이지 않음에도 최대한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
224 이름 없음 (6022015E+5) 2018. 6. 11. 오후 10:39:50갑작스레 소낙비가 내리던 날, 인적 드문 거리의 가로등만이 침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아! 아악! 너 싫어!"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만 하란말야 제발!"
날카롭게 내지른 목소리는 금세 빗소리에 묻혀 가라앉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나리는 거센 빗방울만이 그녀를 위로하듯이, 그를 질책하듯이 그녀의 울음소릴 삼키고서는. -
225 이름 없음 (8707488E+5) 2018. 6. 12. 오전 3:43:57“후우, 하아…하아.”
벽에 기대앉아 거친 호흡을 진정시키던 청년은 망설임과 깊은 절망 사이의 얼굴로 허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결심했다는 듯이 시선을 내려, 피투성이가 된 소매를 천천히 거둔다. 너무나도 선명한 사람의 이빨자국과 뜯겨나간 살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안돼, 안돼안돼. 너를 두고 먼저 갈 수 없어.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소매를 가렸다. 상처가 옷소매에 쓸리며 욱씬거림 이상의 커다란 고통이 엄습해왔다. 아파, 하지만. 옆에 널부러져있는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한 청년은 흰 압박붕대를 꺼내들었고, 이빨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물린 상처 위에 붕대를 감았다. 중간중간 신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변에 좀비가 없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 상처는 이제 괜찮아. 시간은 아마도 48시간. 이제 웃는 연습을 하자. 바닥의 유리조각을 집어들어 파래진 안색으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점점 나아져갔다. 그렇게 청년은 웃는 얼굴로, 자신의 소중한 이의 곁으로 돌아갔다.
“미안, 오래 기다렸지? 식량을 좀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후르츠 칵테일이야.”
/소중한 이는 가족, 연인, 친구 다 좋아 ' '! 자유롭게 이어줘 -
226 이름 없음 (8157863E+4) 2018. 6. 13. 오전 4:34:29>>225"과일이라니 오랜만이네..."
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세계가 오기전까진 너와 이렇게 대화나 할줄 상상도 못했어
너와 난 사는 세계가 달랐으니까 나처럼 어둡고 우울한 난 너에게 다가가는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에겐 나뿐이지
다리를 끌면서 침대에서 내려왔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일까 그조차도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뭐 사실은 다 연기이지만
너는 알고있을까? 사실 다 거짓말이였다는거
네 주위사람들을 일부러 좀비들에게 백신은 숨긴채 감염시키고 그사이에서 괴로워하던 널 구하며 다리다친 척해왔단걸 알면서도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해줄수있을까?
"...왜이렇게 창백해?"
널 관찰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무슨일이 있었던걸까? -
227 이름 없음 (7963136E+5) 2018. 6. 13. 오전 10:50:45>>226
“응, 과일엔 영양소도 많으니까 분명 다리를 낫게하는데 도움을 줄거야.”
청년은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척을 하기보다는 평범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 속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비명을 지르고있었다. 짧은 심호흡 후, 캔 오프너로 후르츠 칵테일 통조림을 따서 스푼과 함께 네게 건넸다. 비틀거리는 네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욱씬거렸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다치는건가. 지금까지 죽여온 친구들과 가족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안죽게하겠다고 다짐하더니, 너 자신을 죽이고 말겠구나. 우리들처럼…그런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건 네 물음이었다. 잠깐동안 너를 바라보던 청년은 방긋, 미소를 지어보였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실은, 어린아이를 봤어.”
죽은, 이라는 말은 일부러 떼두었다. 거짓말은 아니다. 쓰러져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다가가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이니까. 청년은 잠시동안 서글픈 미소를 머금었고,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얼른 먹어봐. 널 위해 가져온거니까.” -
228 이름 없음 (8157863E+4) 2018. 6. 13. 오전 11:18:19>>227아이라니....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죽은 아이겠지 이 세상에 살아남은 아이따위 존재하지 않을테니
넌 마음이 약하니 분명 그곳에서 발을 떼기 어려웠을꺼야
그래서 이런 상처를 얻었겠지
"이거 왜 이런거야?"
분명 나가기전엔 붕대를 감지 않았었지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며 평소와 다른 위협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은것이겠지만 그가 나에게 비밀을 만든단 사실에 화가난다
"줘봐 내가 다시 매줄께" -
229 이름 없음 (7963136E+5) 2018. 6. 13. 오후 12:06:18>>228
어릴 적부터, 자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착한 아이로 보이는지도. 사람마다 호감을 얻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 얼추 비슷했다. 네가 다른 때보다 화난 듯한 어조로 말하며 청년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자, 놀란 기색도 없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괜찮아. 별 거 아니라서 일부러 말안한거지만…실은 마트 창고문이 잠겨있길래 억지로 여느라 힘 좀 썼어. 나사가 튀어나와있는걸 못보고 부딪혔거든.”
어떤 비밀을 지키고싶을땐, 무조건 숨겨서는 안된다. 들키고 난 다음의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버리니까. 진실 속에 거짓을 숨긴다. 일부러 너에게 들키기 쉽게 소매를 살짝 걷어올린 것도 그 이유에서다. 큰 비밀은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소독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무리하지마. 지금은 네 다리가 더 걱정이니까…”
청년은 슬픈 듯한 눈으로 너를 바라보며 자신을 끌어당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얹었다. -
230 이름 없음 (1849438E+5) 2018. 6. 13. 오후 12:19:05>>217 두달이나 지난 레스지만 혹시 아직 보고있니? 괜찮다면 이어보고 싶은데!
-
231 이름 없음 (4298283E+5) 2018. 6. 13. 오후 12:31:46>>230 헠 왠지 들어와보고싶더라니 (동공지진) 보고있어! 이어주면 정말 감사하지...!
-
232 이름 없음 (1849438E+5) 2018. 6. 13. 오후 12:38:32>>231 우와아아아앜ㅋㅋ 이렇게 바로 만나게되구나 ㅠㅠ 지금 잠깐 외출중이라... 곧 들어가니까 되는대로 써 올게!!
-
233 이름 없음 (4298283E+5) 2018. 6. 13. 오후 12:40:40>>232 그래 기다릴게! 이따보자!
-
234 이름 없음◆y0ExY51O.2 (6977509E+5) 2018. 6. 13. 오후 4:53:21>>217
잠시 정적이 흐르고 빛이 보이지 않는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물쩍하게 멈춰 섰다. 단정한 머리에 테가 동그란 안경을 쓴 이십 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바닥에 웅덩이를 이룬 핏물과 피범벅이 되어 너부러진 원피스가 조금 전 그가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는 방증이지만, 그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여인은 그것의 반증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괜찮아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 그러나 방 안에 진동하는 아찔한 피 냄새는 그에게 죽음을 각인시켰고, 그를 다시금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그는 죽는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다. 비틀거리며 숨을 참던 그는 현실을 인지하자 벽을 짚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읍, 윽...."
괴로운 듯이 가쁜 숨을 내쉬는 그의 입술 아래로 끈적한 타액이 몇 방울 떨어진다.
//이어왔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
235 이름 없음 (4298283E+5) 2018. 6. 13. 오후 5:37:10>>234
조금만-몇 초만 상대가 늦게 나왔어도 그녀가 직접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으로 가서 끌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세던 카운트다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상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상대는 멀쩡하게 생긴데다 차림도 멀끔한 남자였다. 이런 곳에 있을 만 해보이지 않는 사람이랄까. 그는 그녀와 그 주변을 번갈아 보더니 되게 뜬금없는 걸 물었다.
"하아?"
그녀 입장에선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었으나 곧 생각을 고쳤다. 일련의 과정을 봤다면 물을 법도 하다고. 그녀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보니 보통 사람들과 생각의 틀이 다르다는 걸 잠깐 깜빡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려는데...
"보시다시피 괜찮달까. 상처도 안 남았...어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그를 보고 그녀가 당황해 새된 소리를 내었다. 피 냄새가 너무 역했나. 아니면 너무 충격적이었나. 그런 걸 생각하며 성큼 그에게로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었다.
"이봐, 괜찮아?! 물 좀 마실, 아니 그건 씻는데 다 썼지. 나가서 깨끗한 공기라도 마시라고. 그럼 좀 나아질 거야."
당황한 겨를에 옷도 채 입지 못 한, 상당히 자극적인 모습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하는 모습은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어보였다.
//늦어서 미안! ;ㅅ; -
236 이름 없음◆y0ExY51O.2 (6977509E+5) 2018. 6. 13. 오후 6:51:19>>235
등을 두드려 주는 그녀의 손길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덕분에 조금은 진정이 된 듯, 헐떡임이 잦아든 그는 메스꺼운 구토감을 억지로 삼켜내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았다. 당황한 목소리로 괜찮으냐 묻는 그녀가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몸을 바로 세운 그는 비뚤어진 안경을 고쳐 쓰고서 여인을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고맙...."
그녀의 선정적인 모습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뒤돌아서며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에 가리어진 동공은 심하게 흔들렸고, 심장 소리는 그녀에게 들릴 정도로 커져 있었다.
"후...."
그는 깊게 탄식했다. 잇따른 충격에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답답하고, 후들거리는 다리는 움직일 생각을 않았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으나 진동하는 피 냄새 또한 견딜 수 없어 잰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어두운 복도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은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작게 중얼거렸다.
"C...?"
//곰손이라 미안해... 늦어도 괜찮으니 느긋하게 이어주라! 그리고 혹시 잇기 힘들면 얘기해주구 :) -
237 이름 없음 (4298283E+5) 2018. 6. 13. 오후 7:23:58>>236
"괜찮다면 다행이고. ...응?"
말을 하다 말고 휙 돌아서는 것에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괜찮아보였는데 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며 튀어나올 듯 쿵쾅대는 심장 소리며 그녀에겐 모두 이질적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야 그녀는-
"음- 모르겠네."
돌아서 비척비척 나가는 그를 보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다 미처 씻기지 못 한 피가 손에 묻어나는 것을 보고 으, 하는 소리와 함께 질색했다. 물 없는데. 이런. 어쩔 수 없이 아까 던졌던 옷을 주워와 손을 대강 문질러 닦다가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직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을.
"어쩐지 좀 춥더라니."
깨달은 이후 내뱉은 말은 고작 그게 다였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물통을 꺼냈던 가방으로 다가간다. 그 때까지 얌전히 열려있던 가방에서 처음 입고 있던 것과 다른 디자인의 원피스를 꺼내어 뒤집어 쓰듯 입었다. 검은색 린넨 소재의 민소매 원피스가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와 잘 어울렸고 그녀의 맵시를 살려주기에 충분했다.
그 후 그녀는 방의 잔해들 중 깨진 유리에 얼굴을 비춰 남은 핏자국이라던가 꼼꼼히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도 잘 빗어 정리했다. 조금 전까지 죽으려 했던 사람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태가 살 정도로만 정리를 마친 그녀는 한결 가벼워진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복도에서 멈춰섰다.
"어라, 아직 안 갔네?"
복도에 쭈그려 앉은 그를 보며 하는 그 말은 지극히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정말 거기 있을 줄 몰랐다는 반응. 어둠 속에서도 붉은 빛이 도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다시 말했다.
"여긴 보시다시피 폐허야. 보아하니 여기 사는 사람 같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그래?"
날이 풀렸다고는 하나 이 밤에 밖에서 자면 입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그대로 그를 지나치려 했다.
//괜찮아 나도 느린 걸 ㅎㅎ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이어줘! -
238 이름 없음◆y0ExY51O.2 (6977509E+5) 2018. 6. 13. 오후 8:37:38>>237
차가운 벽이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가 흘린 피는 가짜가 아니었고, 그녀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죽으려 했다는 것이 무색하게도 죽음을 마주하고 보니 그것이 두려워졌다. 어쩌면 각오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역겨운 새끼'
'사회악'
'인간말종'
경멸 어린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맴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그를 손가락질한다. 가해자는 권력에 숨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그는 혼자 힘들어해야만 했다.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가 서 있을 자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죽자."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이다. 당장에는 이 상황에 의문이 들지 않았다. 죽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는 어금니를 물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저기요."
묵묵부답이던 그는 그녀가 떠나려 하자, 돌연 옷깃을 붙들고 매달렸다.
"총 좀 빌려주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차려야 해서 급하게 쓰느라... ㅠㅠ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 부탁해! 그리고 저녁 꼭 챙겨먹구. 조금 이따 다시 올게! -
239 이름 없음 (4298283E+5) 2018. 6. 13. 오후 9:11:29>>238
이런데서 잠들면 입 돌아가기 십상이다. 그 말을 하고 그녀는 그를 지나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지 못 했으니 살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이 죽지 못 한 그녀의 의무였고 이어가야 할 일상이었다. 그래서 가려는데 돌연 옷깃이 붙들렸다.
"뭐?"
그녀는 제 옷을 잡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말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붉은 눈이 무기물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어딘가 간절해보이는 그를 응시하다가 도톰한 입술을 열었다.
"그것은 그래보여도 확실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다. 정수리나 턱 밑에 내고 방아쇠를 당기면 그대로 반대편까지 관통해버릴 정도로 강한 녀석이지. 보통 인간이 반쯤 장난으로 만져볼 물건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 거라고."
살짝 돌려 말했으나 그 말의 의미는 빌려주지 않겠다 그 자체였다. 그대로 치맛자락을 털어 그의 손을 떼어내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탁- 소리나게 디딘 낮은 굽의 구두. 그 앞코에 미처 닦아내지 못 한 핏자국이 번들거렸다.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지금은 밤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서 그를 향해 말했다.
"뭐 때문에 그것을 빌려달라는지는 대강 이해가 가나 그대가 여기서 그걸로 죽는다면 내게 그걸 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버려.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건 안 될 얘기라서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빌려줄 수 없으나 내가 대신 그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에게 귀가 솔깃할지도 모를 제안 아닌 제안을 하며 가방에 손을 넣는 그녀. 잠시 뒤적거린다 싶더니 날 선 칼을 하나 꺼내었다. 어둠 속에서도 시퍼런 빛을 번뜩이는 얄쌍한 회칼을 꺼낸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아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 손을 움직여 목을 겨누도록 '도와주었다'.
"자. 말만 해. 이대로 찔러넣어 줄 터이니."
그의 목을 겨누는 칼의 푸르스름함, 그 칼을 쥐도록 도와준 그녀의 하얀 손, 하얀 팔. 언제라도 찔러 줄 수 있다는 듯 차분하게 가라앉은 붉은 두 눈. 조금 전 그의 안부를 염려하며 등을 두드려주던 '인간'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었다.
//맛저하고 와~ -
240 이름 없음◆y0ExY51O.2 (6977509E+5) 2018. 6. 13. 오후 11:25:53>>239
날이 잘 선 회칼이 제 목을 겨누도록 '도와준' 여인의 손길이 어째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빈손으로 매었던 넥타이를 풀고서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끌어당겼다. 칼끝에 걸린 작은 핏방울이 날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것만으로도 아픔은 충분했다.
"저...."
망설임 가득한 목소리가 비집고 나온다. 만일 관자놀이에 총을 쏘았다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었겠고, 손에 든 넥타이로 목을 매었다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터였다. 하물며 칼에 찔려 죽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윽... 으...."
죽고 싶은데 죽고 싶지 않아 아픈 신음을 흘리는 와중에도 제 목에 칼을 들이밀게 한 여인은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은 눈처럼 희었고, 싸늘하게 내려보는 붉은 눈동자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악마처럼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키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을 받아들인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애처로이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이.
// 많이 늦어서 미안! 다녀왔어 :) -
241 이름 없음 (6686245E+5) 2018. 6. 14. 오전 12:50:08>>240
그녀가 겨눠주고 그가 끌어당기는 칼의 날이 얕게 살갗을 베자 붉은 피가 작게 방울져 맺혔다. 맺히기 무섭게 날을 따라 흐르는 붉은 줄기를 그녀는 무감정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원하면 그 칼을 목에 꽂아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흠."
짧은 신음에서부터 망설임이 느껴진다 싶더니 시간을 끌수록 죽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맞잡은 손을 통해 느껴져왔다. 그녀가 자신의 목을 찌르거나 머리에 대고 총을 쏠 때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눈 앞에 보이자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녀와 달리 목을 비틀기만 해도 죽는 나약한 인간이 죽고 싶지 않으면서 죽으려 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신기했다. 그랬다. 그래서-
"음, 아니, 싫어. 관둘래."
태도를 싹 바꿔 그에게서 칼을 뺏었다. 능숙하게 칼을 빼내어 가방에 도로 넣고 그에게로 몸을 훅 가까이했다. 무얼하나 싶은 순간 그녀의 혀가 칼에 베인 상처를 핥았다. 진득한 타액이 상처를 스치자 순식간에 아문다. 음. 핥는 순간 느껴진 비릿한 피 맛을 음미하듯 소리를 흘리고 몸을 일으키는 그녀였다.
"내 목숨조차 제대로 끊지 못 하는데 남의 명을 끊어봐야 뒷맛만 찝찝할 뿐이지. 마음이 바뀌었네. 죽으려면 직접 죽는게 어떨지?"
마치 순간순간 기분이 바뀌는 어린아이의 변덕처럼 했던 말을 바꾸며 일어선 그녀. 그대로 다시 휙 돌아섰다. 검은 치맛자락과 검은 머리칼이 가볍게 찰랑이며 떴다가 가라앉고 있었다.
//어서와- 근데 나 이제 슬슬 자야 할 거 같네... 괜찮으면 자고 일어나서도 잇지 않을래? -
242 이름 없음 (9763171E+5) 2018. 6. 14. 오후 6:53:29>>241 어제는 잘 잤어? 오늘 종일 바빠서 접속을 못했어ㅠㅠ 나야 시간만 된다면 계속 잇고싶어! 그런데 주말에는 바쁘고 평일도 상시 접속은 힘들 것 같고. 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
243 이름 없음 (6686245E+5) 2018. 6. 14. 오후 7:57:34>>242 응 난 괜찮아! 하루에 하나씩 이어도 좋을거같아ㅎㅎ너참치가 부담 안 되는 한으로 이어주면 나도 확인하는대로 답레 해둘게.
-
244 이름 없음 (7634876E+6) 2018. 6. 16. 오후 2:20:42“아,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 특유의 남색 고깔모자를 쓴 소년이 슬며시 인사를 건넨다. 앳된 얼굴에 밝은 자주색 눈동자. 어딘가 긴장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에 메고있는 떡잎이 자란 나무 지팡이는 어느정도 희귀 아이템인 불란드의 지혜. 나머지 방어구들과 악세사리도 매직 아이템으로, 마력과 관련되어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어깨에 붙어있는 붉은 도마뱀일까. 신비한 마력장벽으로 둘러쌓여있으며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불꽃이 인다.
“주점 쪽 공문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던전에 도전하신다면서요? 저도 마침 그 던전 레벨대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전위를 못찾아서…아, 전 소예라고 합니다. 소환계열이에요.”
#가상현실! 온라인! -
245 이름 없음 (4331139E+5) 2018. 6. 18. 오후 7:22:02>>243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들어왔는데 흐름이 너무 팍 끊겨버려서.... 정말 미안ㅠㅠ!!
-
246 이름 없음 (676664E+51) 2018. 6. 18. 오후 9:58:25>>245 아냐 괜찮아 ㅎㅎ 많이 바빴나보다 고생 많았어!
-
247 이름 없음 (388024E+55) 2018. 6. 18. 오후 11:55:39>>246 계속 있었구나! 내가 이야기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너참치 글에 관심 가지고 다가간 건 난데 정말 미안해. 잠깐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어! 음... 계속 주절거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일게.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
-
248 이름 없음 (4677858E+6) 2018. 6. 23. 오후 1:46:03온통 하얀색. 벽도, 바닥도, 침대도, 가구도, 옷도, 전부 다.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리겠어. 어지러워. 한쪽 벽이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연구실 안으로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있다. 소년 혹은 청년 사이의 모습을 하고서 꼼짝도 않던 가는 몸이 곧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움찔한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자 흐트러진 백발 너머로 마른 눈이 느릿하게 깜박인다.
"..박사님."
잠긴 목소리를 겨우 내며 당신을 부른다. 당신은 어쩌면 이틀째 식단을 기어코 거부한 실험체를 살펴보러 온 것이리라. 마른침을 삼키며 침대 아래로 두 다리를 내렸다. 나 못 하겠어요.
"이젠 지긋지긋해. 그만 내보내줘요."
약속했잖아. 이번만 버티면 놓아주기로.
"약속했잖아. 내 사랑."
//연구원이나 과학자x실험체가 배경이고 성향은 남x남으로 돌려볼 레더 있으면 언제든 찔러줘~ 실험체는 돌연변이든 바이러스 백신 만들려고 실험하는 실험체도 상관 없고 수인이나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서 편하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둘의관계는 혐관이어도 좋고 애증이어도 좋고 그냥 연플이어도 상관없어! -
249 이름 없음 (8494125E+5) 2018. 6. 25. 오후 5:24:09>>248
실험체가 이틀째 식사를 거부 중이라고. 노트에 뭔가를 휘갈겨 쓰던 박사가 고개를 들었다. 곤란한 얼굴로 우물우물 말을 꺼내는 보조 연구원에게 짜증 섞인 시선을 보내자 그가 흠칫 움츠러들며 예, 대답했다.
박사의 독살맞은 성격은 유명했다. 젊은 나이에 박사를 달고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실험의 총 책임자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뒷말이 제법 나오기도 했으나 그 성격 탓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박사의 눈치를 살피던 연구원은 박사가 꺼지라는 듯 손을 휘저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리라. R-45는 중요한 실험체였으니까.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창. 박사는 바깥에서 한참을 서서 유리창 안의 실험체를 바라보았다. 미동 하나 없이 웅크린 마른 몸.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사가 안경을 벗었다. 무테 안경 뒤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던 눈빛이 한층 더 날 선 채 다가왔다.
"R-45. 어리광 피우지 마라. 시체로 나가고 싶나?" -
250 이름 없음 (1947844E+5) 2018. 6. 25. 오후 7:32:10>>249
날카롭게 배어있는 얼음처럼 차갑다. 매섭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도 이정도는 아닐 거야. 청년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겨우 물기를 참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메마른 입술이 치아에 짓이겨 언듯 피맛이 났다. 박사님, 당신 정말이지
"왜 항상 그런 식이에요? ...미워. 미워 죽겠어."
두 손으로 침대시트를 움켜쥐며 가까스로 바닥에 닿은 두 발을 살짝 웅크렸다 피기를 반복했다. 그의 차가움에 데일 듯한 날이 있는가하면, 몸을 꼼짝도 못할 정도로 얼게 만드는 날도 있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내가 딱 메말라 죽기 직전에만 데일 것처럼 구는거죠? 괜한 서러움이 밀려와 안 그래도 피가 배인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깨물었다. 밀려오는 통증을 익숙하게 참아내며 맥없이 상체를 뒤로 뉘었다. 쓰러지듯 뒤로 넘어지기 무섭게 푹신한 감각이 머리를 울렸다. 어지러워서 작게 앓는 소리를 냈다. 나 너무 어지러워. 하얀 천장을 힘없이 바라보며 그를 불렀다.
"그래, 차라리 죽여줘요. 자, 난 준비 됐어."
당신 손에 죽는 거라면 그것도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입술을 조그맣게 움직여 혼잣말을 했다. -
251 이름 없음 (7433952E+4) 2018. 6. 25. 오후 11:05:34>>250
박사의 인생에 어려운 건 그리 많지 않았다. 명석한 두뇌, 훌륭한 가문, 준수한 외모. 학문조차 그에게는 쉬웠다. 새로이 만들어 내 학계를 뒤집은 이론이 몇 개던가. 그가 하겠다 마음 먹은 일 중 해내지 못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실험체가 어려웠다. 작은 놈이 죽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워 온 게 실수였다. 그는 그저 그의 새 약물의 효능을 증명할 대상을 찾았다 생각했을 뿐이었다. 짹짹거리는 작은 새 같다 생각해 살리고 키워냈을 뿐이었다. 오직 실험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처음처럼 구원자를 보는 듯한 말간 눈으로 저를 볼 때면 그만,
"몸에 상처 내지 마. 네 것이 아니다."
실험체의 옆에 걸터 앉은 박사가 그의 눈 위에 손을 덮어 빛을 가렸다. 죽여 달라는 말에 박사의 눈이 살짝 찡그려졌다. R-45는 실험이 완료되면 폐기될 것이다. 완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당연한 수순인데, 그가 제 미래를 알고 있는 것 마냥 저리 말하니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였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툭 던지게 된 것은.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지?" -
252 이름 없음 (4985243E+5) 2018. 6. 26. 오전 10:01:34>>251
자신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이따금 애매한 표정을 했다. 화내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그런 표정. 이상한 빛깔이었다.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는 했지만. 입술에 밴 핏물을 혀로 축이자 비릿한 철분 맛이 났다. 꼭 그에게 품은 제 감정 같았다. 정작 그는 자신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데 자신 혼자만 그를 바라보는 꼴이. 이게 사랑인지, 원망인지, 증오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희망 따위 꿈꾸지도 말라는 듯이 갑작스럽게 차단된 시야에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언젠가 실험 당하기 전 눈을 가린 것 같은 감각에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눈을 덮은 그의 손을 건드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서야 조금 어색한 미소를 흘린다. 박사님은 항상 나에게만 가혹해.
"알아요. 난 박사님 실험체니까 박사님 거지."
난데없는 질문에 실험체는 곧바로 대답했다.
"박사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손을 건드리다 말고 그나마 생기가 돌아온 목소리를 냈다. 그게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도 그 즈음.
"농담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박사님이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갈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갈라진 목소리를 겨우 토해내며 제 눈을 가리던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다. -
253 이름 없음 (4245405E+5) 2018. 6. 26. 오후 5:37:32>>252 ㅠㅠ 미안 오늘 밤에 올게!
-
254 이름 없음 (4985243E+5) 2018. 6. 26. 오후 6:18:12>>253 앗 천천히 이어줘!
-
255 이름 없음 (3325019E+5) 2018. 6. 27. 오전 1:46:11>>252
늘 그랬다. 하얀 방에 갇힌 주제에 저리 푸른 꿈을 꾸곤 했지. 희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깨닫지 못한 채 실험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박사가 얼어붙었다.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 그 목소리가 뱉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 도망간다고. 이 내게서? 실험체가 그의 손을 밀어 내려 하자 박사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도망?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는 건 시체가 되어서 뿐이다. 박사가 저를 밀쳐내려 하던 실험체의 손을 잡아 눌렀다. 순식간에 열화처럼 끓어 턱 끝 까지 차오른 분노를 애써 억누른 채 서늘하게 말을 뱉는다.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군. 실험 이어서 진행하지."
사실 거짓말이다. 그가 너무 아파해 당분간 실험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실험이 끝나면 그는 폐기될 것이기에 실험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 할 생각이었다.
네가, 그런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감히 네 멋대로 나를 떠날 것 처럼 굴지만 않았어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
256 이름 없음 (7979014E+5) 2018. 6. 27. 오후 2:23:06>>255
갈라진 입술 사이로 윽, 하는 작은 비명이 짧게 터져나왔다. 강압적으로 눌린 손이 움찔 떨렸다. 아파. 아파요. 목까지 차오른 말이 턱, 하고 막힌다. 어두웠던 시야가 트인 것도 잠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와 시선이 얽힌 까닭이다. 원래부터 차가웠던 표정에 더 금이갔다. 필히 그의 심기를 건드렸으리라.
"아니, 아니에요. 아, 박사님..!"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를 따라서 실험체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부여잡았다. 느닷없는 현기증이 밀려들어 크게 휘청였다. 실험이 끝날 때와 꼭 같은 현기증과 구토증세. 겨우 중심을 잡고서 숨을 참고 눈을 감고 밀어냈다. 이 사이로 피 섞인 침이 흘렀다.
"가지마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도망간다는 말 안 할게요. 응?"
흰 가운을 부여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다. 날 여기로 밀어 넣은 건 당신이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미워요. 못됐어. 진짜, 진짜. 그의 등 뒤로 고개를 묻자 백발이 흐트러지며 눈가를 가렸다. 절박하게 그를 붙잡았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가지말아요, 내 사랑. 나 두고 가지 말아요. 도망 안 갈게요, 정말이야."
당신이 너무 미워. -
257 이름 없음 (5502088E+5) 2018. 6. 28. 오후 8:42:28갱신
-
258 이름 없음 (5891125E+5) 2018. 6. 28. 오후 9:46:04>>256 으아아 미안해 내가 어제 오늘 일이 점 있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ㅠㅠㅠㅠ이따가 밤에 이어올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 ㅠㅠ
-
259 이름 없음 (5127616E+5) 2018. 6. 29. 오전 1:27:54>>256
등 뒤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박사가 순간 얼어붙었다. 살아있는 온기가 감정을 가진 채 제게 전해져 온 게 얼마 만이던가. 머리가 어질거렸다. 이건, 어렵다.
박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새하얀 백발. 시체처럼 창백한 피부. 그러나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다. 제게 매달린다. 제가 유일한 구명줄인 것 마냥, 손아귀에 쥔 새가 퍼드덕거리듯.
가엾게도, 떨고 있군. 박사가 실험체의 턱을 잡아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온통 하얗기만 한 그의 얼굴에 유일하게 색이 있는 부분인 눈동자, 딱지와 새로 터진 상처로 뒤덮인 입술, 그리고 그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피.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박사가 그의 턱을 잡지 않은 손 옷깃으로 실험체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피 한 방울까지 제 것이어야만 했다. 그를 실험실에 넣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 그는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R-45라는 이름 아래에. 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제 어미가 떠올랐다. 아비가 쳐넣은 실험실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게 제가 기억하는 살아있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과거 유일했던 온기를 잊지 못하고 그 시체라도 보기 위해 어린 그가 어떤 노력을 했던가.
시체에는 온기가 없었다. 지금, 그 때 잃어버린 무언가가 조금쯤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이건가. 가설을 세워볼까. 내 가여운 짐승, 박사가 실험체의 머리를 도닥였다. 메리, 박사가 제 어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조만간 나가게 해 주마."
내 메리, 이번 만큼은. -
260 이름 없음 (2512749E+5) 2018. 6. 29. 오후 7:16:28>>259 에고 아니야ㅠㅡㅠ 나야말로 오늘 밤에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기다려줘~ㅠㅠ
-
261 이름 없음 (4832473E+5) 2018. 6. 30. 오전 2:23:04>>260 앗 천천히 여유로울 때 이어줘 ㅎㅎㅎ
-
262 이름 없음 (6620351E+5) 2018. 6. 30. 오후 2:46:14>>259
늘 이런 식이었다. 한계 끝까지 밀어 붙이고 더는 뒷걸음 칠 곳 없어 떨어질 찰나에 기다렸다는 듯이 붙잡아준다. 그때마다 말과 행동, 방법이 다를 뿐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이 키우는 꽃이 목말라 죽을 때에만 겨우 달디단 물을 흘려줬다.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잡으면서도 서러운 마음에 마음이 곪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자신이 그밖에 없다는 걸 확인시키고 나서야 돌아봐주는 그가 야속했다. 천천히 들린 고개 너머로 그의 표정은 어떠했나. 평소같았나. 아니면,
"...당신은 항상 나에게서 다른 이를 보는군요."
박사라는 호칭을 버려두고서 쓴 말을 입안에 품었다. 나를 만지고 괴롭히면서 당신의 추억을 쓸고 있구나. 메리, 귀에 닿은 저는 알지 못하는 인영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나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투영된 사라진 사람이야? 처연한 미소로 가만 그를 올려다보던 실험체가 천천히 발 뒷꿈치를 들어올렸다. 나가게 해준다고?
"응, 이번엔 정말이죠? 약속 지켜야 돼."
실험체가 뒷꿈치를 바짝 올려서야 두 손으로 박사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춘다. 아기가 배냇짓을 하듯 부드럽게 입술을 움직이다 반응이 오기 전에 억지로 고개를 비틀어 입술을 떼었다.
거짓말 하지말아요. -
263 이름 없음 (0258679E+5) 2018. 7. 1. 오후 11:48:39>>262 흑 미안 요새 좀 바빠서.. 오늘 ㅈ새벽에 달아 두겠습니다 ㅠㅠ 미안해요!
-
265 이름 없음 (260555E+56) 2018. 7. 3. 오전 1:20:04>>262
당신이라니, 건방지기도 하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멍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 박사가 느리게 제 입술을 더듬었다.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약속 지켜야 돼. 홀린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제법 빠르게 흘렀다. 그 사이 실험은 한 단계 더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고 실험체는 말라갔다. 박사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준비할 것이 많았다.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그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것.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은 특정 유전자에 다양한 자극을 가해 변이를 일으키고자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체는 제가 그를 발견했던,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도 자극 한 번으로 기적적인 회복력을 발휘해 그 잠재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제 실험체의 유전자는 붕괴 직전에 있었다. 마지막 실험에서 변이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제 어미처럼.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변이 가능성도 가장 높았지만, 고작 5퍼센트의 가능성에 걸어 볼 수는 없었다. 예전의 그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를 온전히 제 품에 안아야 했다. 그는 박사가 살면서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두 번째의 것이었다. 이번 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다. 뒤늦게 자각한 감정은 온 몸과 마음을 집어 삼켰다. 그리고 박사는 모두의 생각보다 조금 더 미쳐 있는 사람이었다. 본디 하나의 기능이 결핍되면 다른 하나가 강해지는 것 처럼.
실험실에 불이 났다. -
266 이름 없음 (1711504E+5) 2018. 7. 3. 오후 8:06:44>>265
나날이 피를 토하고 코피를 흘렸다. 그럴 수록 약인지 약물인지 모를 주사를 맞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는 오지 않았다. 식단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엔 최소한의 양분만 주사를 통해 주입시켰다. 그래도 그는 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팔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가득했고 잠 못 드는 나날이 지속됐다. 꺼내준다고 했잖아. 나가게 해준다면서. 그가 미웠다. 당신만 몰라. 왜 당신만 몰라요? 날 괴롭히는게 그렇게 좋아? 이젠 후련한가요?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아랫입술만 자근자근 깨물었다. 부르튼 입술이 평소보다 더 붉다. 당신이 너무 미워.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처음 그에게 구해졌을 때, 어쩌면 자신은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에게 마음을 품고 나서 그 현실을 직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너무 아파.
실험체 R-45 23시경에 도주. 다시 한 번 말한다. 실험체 R-45가 23시경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였다.
실험실에서부터 불이 번져가는 연구소 안에서 날카로운 경보음과 다급한 안내음이 들린다.
비틀거리면서도, 벽을 짚고 겨우 다리를 움직이면서도 맨발을 억지로 움직여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쳤다. 어느새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입으로 가쁘게 뱉어내며 힘겹게 가슴팍을 한손으로 부여잡았다. 그리고 겨우 연구소 뒷문을 벌컥 열고 뒷길로 한참 뛰어가자 철조망이 보였다. 여기만 넘어가면.
새장 안에 같인 새가 새장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희열은 바깥의 시원한 공기보다 더 달콤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 해방이야. 지긋지긋했어, 정말. 지긋지긋 했다구요. 알아? 나는 노력했어.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해줘야 하나요? 내가 떠나면 당신은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그 전부터,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당신은 내 목을 조르며 내게 상처 주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죠. 이미 상처가 터져 찢어진 입술을 자꾸만 세게 깨문다. 눈이 너무 뜨거워 손등으로 다급히 문지르자 느닷없이 물기가 잔뜩 묻어나왔다. 당황하던 것듀 잠시 눈을 깜박일수록 자꾸만 볼을 타는 눈물에 더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허무한 표정으로 두손을 적신 감정을 내려다봤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도 잠시 뒤로부터 들려오는 인기척에 어깨를 움찔 떨었다. 아, 당신이다. 도망 가야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나는. 나는 영원히. 뒤섞이는 공포와 갈망을 뒤로한 실험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도망가, 제발.
"...박사님, 내가 이렇게 된 건"
젖은 목소리가 갈라진 채 흘렀다. 당신을 노려보는 젖은 눈동자는 날카롭지만 그만큼 애틋했다. 내가 끔찍한 새장 안에 갇히게 된 건, 내가 당신에게서 도망가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에요." -
267 이름 없음 (8610037E+5) 2018. 7. 4. 오후 5:54:17>>266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려댔다. 차단기가 내려가고 앞다투어 달아나는 연구원들 탓에 실험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러나 박사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화재도, 탈출해야 한다는 보조 연구원의 재촉도 아닌 ‘R-45'였다. 안 돼……! 차단기가 내려가 모든 인위적인 불빛이 사라졌음에도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 탓에 눈이 부셨다.
불은 위험하다, R-45는 갇혀 있고. 그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황망한 얼굴을 한 채 화마로 뛰어들려던 박사의 몸이 멈추었다. 화마 속,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은 R-45가 아니었다. 메리……. 박사가 신음했다. 우르릉 거리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매캐한 연기와 타는 열기에 숨이 턱 막혔다. 메리, 나는,
정신을 차리자 박사는 뒤돌아 달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흘려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R-45가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어떻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를 쫓는 것. 내가 R-45였다면 이 경로로 달아났을 것이다. 손이 무거웠다. 연기를 제법 들이마신 탓인지 폐부가 아팠다. 그럼에도 그는 달려야 했다.
멀리 희끄무레하게 R-45가 보였다. 힘겹게 움직이던 그가 제 발소리를 알아챘는지 멈춰 섰다. 가까워 진 그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박사가 주춤했다. 뒤를 돌아 선 그와 눈이 마주친 탓이다. 그가, 나를 두려워 해. 축축한 목소리가 귀를 적셨다. 전부 나 때문이라고. 맞다. 그 사실이 저를 너무도 비참하게 했다. 맑고 푸르던 그를 병들게 한 것은,
말이 없던 박사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제 앞에 내려놓고 물러섰다. 무너져 내리는 실험실과 불꽃이 R-45의 얼굴 위로 어룽어룽 비치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자, 이걸 가지고 가.”
저 돈이면 충분히 새 신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살 새 집도 구해 두었었다. 평생을 실험실에 갇혀 있었던 그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새 보금자리가 되어 주겠지. 눈앞이 흐렸다. 후두둑,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눈앞이 맑아졌다 흐려졌다를 반복했다. 염치 없게도, 그가 다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268 이름 없음 (2972994E+6) 2018. 7. 4. 오후 9:22:28>>267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었다. 무언가가 목에 잘못 걸린 것처럼. 어쩌면 생선가시가, 어쩌면 서러움이, 어쩌면 그를 향한 감정이.
급하게 뛰어온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는 그의 표정에서 처연함이 느껴졌다. 모든 걸 손에서 놓은 사람마냥 가방을 내려놓고 물러난다. 당신이 먼저 뒷걸음치는 건 처음봐요. 손등으로 벅벅 눈가를 문질러보아도 좀처럼 그치지 않는 눈물 탓에 울음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당신 마음대로 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놓아준다고? 그건 내 목숨에 대한 값인가요?
"...항상 늦어요."
난생 처음보는 그의 차가운 눈물을 시야에 담고서야 실험체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박사님은...박사님은 항상 늦는다구요, 항상. 항상!"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항상 그랬다. 자신은 마음으로 그를 느꼈고, 그는 머리로 자신을 느꼈다. 같은 감정을 가졌어도 생각은 달랐겠지. 실험체가 비틀비틀 걸어가 두 손으로 멱살이라도 잡듯 그의 옷을 꽉 붙들었다. 서럽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꾹꾹 눌러삼키는 숨소리가 힘겨웠다. 울지 마요, 당신 울면 안 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이 돈이면 박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내 감정도 전부 잊고 살 수 있나요? 말해줘요. 이거면 돼요?
...내 마음 전부 알면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진짜 못 됐..으, 흐윽, 진짜 너무 밉다구요..."
결국 울음을 못 참고 고개를 떨군 채로 억눌려 흐느꼈다. 못 됐어. 못돼 처먹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미끄러지듯 그의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그게 가당키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자신은 애초에 실험실을 떠나면 어딜가도 죽을 운명이었다. 명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요, 이대로 보내줄거라면.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며 절박하게 애원했다.
"차라리 박사님이 나 죽여줘요. 응?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그럼 정말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야. 더는 떼 안 쓰고, 억지도 안 부릴게요. 한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똑같은 통증, 똑같은 괴로움. 나 정말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
269 이름 없음 (5417426E+5) 2018. 7. 6. 오전 3:14:01>>268 으윽 으윽 오늘 안에 답레 들구 오겠습니다 ㅠㅠ 미안해!
-
270 이름 없음 (9862164E+5) 2018. 7. 6. 오후 12:59:24>>269 앗 괜찮아 천천히 이어줘~!
-
271 이름 없음 (3052637E+5) 2018. 7. 10. 오후 3:39:22>>268
실험체의 얼굴은 눈물로 한껏 젖어 있었다. 늦었다고, 항상 늦는다고 저를 원망하며 질책하는데 한 마디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 자체가 이렇게나 뼈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턱 막혔다. 그의 울음을 보자 가슴이 답답했다. 가슴이라기 보다는 심장 부근이 꽉 죄어드는 것처럼 아팠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제 멱살을 쥐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소리치는 실험체를 보는 박사의 얼굴이 처연하게 일그러졌다. 어릴 적 바닷가에 갔었다. 하얀 모래가 너무 고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손바닥 한 가득 퍼 올렸었지. 그러나 모래는 제가 어찌 하려 해도 손 틈 사이로 주루룩 빠져 나갔다. 담고 쥐고 막으려 해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아귀를 빠져나간다. 박사는 비참해졌다.
박사가 주저앉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절절한 목소리로 그가 하는 부탁의 내용이 너무 끔찍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있는 줄은 몰랐다.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다. 몰랐다는 이유로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 하고 박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파.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건 망가뜨리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눈 앞이 흐려 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사라질 것만 같았다. 안 돼……. 박사가 눈물을 닦아냈다. 박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게. -
272 이름 없음 (3052637E+5) 2018. 7. 10. 오후 3:40:17너무 너무 늦어서 미안해 ㅠㅠ 으윽 사과밖에 할 수 없는 게 꼭 박사와 같네..
-
273 이름 없음 (2058445E+5) 2018. 7. 14. 오후 6:07:30“헤어질 때가 왔소, 주인이여.”
현대 시대의 의복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소복을 입고있는 청년은 뒷짐을 진 채 서서 저물어가는 해질녘을 바라보고 있다.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을과 자신의 몸이 주홍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것을 나른한 눈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을 걸쳐 살아오면서 이만큼이나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은 없었다. 수많은 주인을 만나고, 헤어지며, 또다시 새로운 만남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과연 나의 주인은 어떠할까. 은은한 미소를 띈 채 몸을 스르르 돌려 주인을 향해 바라본다. 긴 머리카락과 흰 소복 역시 바람에 흩날린다.
“주인이시여,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사라지기 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봐두고 싶으니.”
/난입자유 -
274 이름 없음 (9372268E+5) 2018. 7. 14. 오후 8:11:38>>271
미안해 나도 이제봤어ㅠㅠㅠ 혹시 아직 있니? 있으면 이으려고 해.. -
275 이름 없음 (1741708E+5) 2018. 7. 14. 오후 8:39:14>>274 앗 타이밍..! 웅웅 나야 고맙지!
-
276 이름 없음 (5769787E+5) 2018. 7. 14. 오후 9:02:40>>271
지독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다. 천국을 보여줬다가, 한 순간에 지옥보다 깊은 나락으로 밀쳐버리는 건. 하지만 이젠 상관 없는 일이야. 완전히 끝난 거야. 나도, 그도. 여기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라도 끝내는 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누구의 잘못도, 어디서부터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닭똥같은 눈물을 떨구며 제 앞에서 서글프게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마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제발."
고개를 도리질치며 말했다. 당신은 미안해하면 안 돼요.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그가 일그러트리는 건 얼굴 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제게 내밀어진 손을 망연히 바라만 보다 떨리는 두 손으로 그의 손 끝을 그러쥔다. 나는 그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사랑해줘요, 박사님."
단지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손을 끌어와 얼굴을 묻었다. 실험체의 눈물로 그의 손이 적셔지는 게 느껴졌다. 차라리 이 감정에 잠겨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
277 이름 없음 (6886471E+5) 2018. 7. 14. 오후 9:11:18>>273
" 그럴 줄 알았어. "
청년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듯 돌린 얼굴의 윤곽은 가느다랐다.
붉은 빛을 띄는 검정색 머리가 날개뼈를 덮고 내려온다, 붉고 흰 배색의 야구 점퍼에 짧은 바지, 검정색 타이즈가 눈에 띄인다.
아무리 봐도 앞에 선 청년과는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옷차림이었다.
어느 쪽이 괴리감을 만들어낼까 생각해본다면 청년 쪽이겠지마는.
" 보면 얼마나 본다고, 어차피 못 보는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
사라질 거면서 괜히 여운을 남겨두려는 듯한 그의 말에 너는 고갤 아예 반대로 돌려버렸다.
순간 뺨에 붙어있는 반창고가 보였지만 그뿐이다. -
278 이름 없음 (9848105E+5) 2018. 7. 14. 오후 11:56:08>>277
“그러니 더욱 오래 봐둬야하지 않겠는가.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가. 첫 주인의 얼굴도 잊었소. 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많은 주인들을 잊어왔지. 사실상, 깊은 연못 그 자체인 것이오. 모두가 가라앉았으니까.”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은 미소가 입가에 감돈다. 의복과 마찬가지로 얇은 천으로 만든 덧신이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 다가가도 되겠냐는 의미를 담아.
“그러나 주인만은 연꽃이오. 고고하게, 수면 위에 홀로 피어있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내 유일한 걱정은 지금 1분 1초라도 주인의 얼굴을 보지못해 연꽃잎이 떨어질까 하는 것이오.”
자색 눈동자 속, 흰 구슬이 굴러가듯 희미한 빛을 발했다.
“부디, 얼굴을 보여주었으면 하오. 주인이시여.” -
279 이름 없음 (7198894E+5) 2018. 7. 15. 오전 12:15:37>>278
" 말도 안 돼, 내가 연꽃? "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연꽃이라고?
대체 왜 날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데.
" 그냥 지금까지처럼 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오래 봐도 마찬가지야, 연꽃도 결국 져버리는 거 알잖아. "
그렇게 말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모질지 못하다.
" 그게 더 슬프다구. " -
280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전 12:43:47>>279
“나도 그러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단걸 알고있소.”
언제나 주인을 위해 인내하고, 누구보다도 슬픈 기억을 안겨주고 싶지 않기에 한걸음 멀리 해왔던 자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의로 좁혀가고 있다. 그 얇고 좁은 막을 찢고서, 주인의 얼굴에 손을 뻗는다. 이렇게도 참을성이 없는 자신은 본 적이 없다. 볼을 부드럽게 감싸고, 손바닥에 마찰되는 반창고의 감촉을 느끼면서, 고개를 들어올렸다.
“연꽃은 그저 하나의 단어이고 표현일세. 주인은 내게 있어 그 어떤 말과 표현, 존재로도 빗댈 수 없소.”
천천히 주인의 볼에 붙여진 반창고를 떼어내, 그곳에 난 작은 생채기에 손가락을 가져다댄다. 짧은 시간이 지나고 볼의 상처는 원래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으나 대신 손가락 끝이 반투명하게 희미해졌다. 그걸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
281 이름 없음 (7198894E+5) 2018. 7. 15. 오전 12:56:58>>280
" 대체 왜 이제 와서. "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손이 네 얼굴로 향했고, 네 볼을 감싸며 부드럽게 들어올린다.
진한 보랏빛 눈이 맑게 흔들린다, 왜 이제 와서 다가오는 거야.
왜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건데.
" 대체 왜... "
사라질 거잖아, 결국은 내 곁에서 사라질 거잖아.
상처를 말끔하게 지운 대신, 반투명해진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 이제 그만해. 날 위해서 희생하지 마... " -
282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전 1:08:32>>281
“보고싶으니까.”
눈이 마주친다. 시선이 마주치는 중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주인의 얼굴……보고싶으니까. 그렇게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마지막은 미소로 보내주지 않겠소?”
반투명해진 손가락 끝자락에 별가루 같은 울렁임이 점점 영역을 넓혀져간다. 볼을 감싼 손의 감촉마저도 희미하다. 주인을 바라보는 눈꼬리가 곱게 휘어진다.
“희생이 아닐세.”
얼굴을 끌어당기고, 자신 역시 허리를 굽힌다. 나즈막이 주인과 입술을 맞댄 채, 고요히 흘러가는 시간을 느낀다. 모든 세계와 별과 우주가 둘만을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다. 탐하듯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춘 후에 빙그레 미소짓는다.
“어찌 이걸 희생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
283 이름 없음 (7198894E+5) 2018. 7. 15. 오전 1:20:41>>282
" ...막무가내야. "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눈을 깜빡이자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쉽사리 눈응 감지도 못한 채로.
" 웃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바보 같으니. "
천천히.
별이 되어 흩어지듯 사라져 가는 모습에 억지로 숨을 참아 넘긴다.
울지 마.
" ...... "
얼굴이 가까워지고, 어느새 두 입술이 맞닿았다.
양 팔을 들어 사라져가는 너를 끌어안는다, 제발 사라지지 말아 줘.
여기에 있어줘.
" 제발, 가지 마, 가지 마... "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
284 이름 없음 (2173562E+5) 2018. 7. 15. 오전 1:43:54"주인님, 주인님. 일어나."
담갈색 머리가 덥수룩한 소년이 여인의 뺨을 가볍게 핥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긴 채 따스한 품 안으로 더욱 파고들며 응석을 부렸다.
"그만 일어나, 주인님."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작은 강아지였던 소년은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인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주인님? 주인님?"
동이 터 오를 무렵, 소년은 평소 그래왔던 대로 여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외딴 산골짜기에 홀로 살고 있는 여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모종의 이유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야. 마녀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 자유롭게 이어줬음 좋겠어! :3 -
285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전 1:55:16>>283
“…….”
주인의 말이 무엇이든 항상 입을 열어 대답했던 그지만, 지금에 와서야 가지말라는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입가에 스며들어있던 미소가 빠지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으로 그저 주인을 바라볼 뿐이다. 너무나도 긴 세월을 살아왔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새 주인을 찾아가고, 헤어진다. 의미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망각에 지워져나갔다. 적어도 자신에겐 미련이란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여, 나는 지금에서야 결심이 섰네. 내게 있어 주인은 인지할 수 없을 시간 동안 쌓아온 내 모든걸 포기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주인은, 내가 귀찮지않은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가? 내가 모든 힘을 잃더라도, 주인으로써 있어줄 것인가?” -
286 이름 없음 (3151285E+5) 2018. 7. 15. 오전 9:48:04>>285
" 당연하잖아! 난 네가 가진 힘을 잃기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사라지는 게 싫은 거란 말이야! "
눈을 깜빡이자 눈물방울이 길을 내며 얼굴을 흘러내린다.
아무것도 못 해도 좋아, 너마저 나를 떠나 버리면 안 돼. 싫어,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 미안해, 까탈스럽게 굴어서 미안해. 너도 언젠가 날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싫어서 그랬어,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쭉 있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흐윽..흑.. "
미안해.
너를 꼭 끌어안은 채로, 뚝뚝 끊기는 말소리를 이어가며 엉엉 울었다.
너무 외로웠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팔을 벌려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었는데.
" 아무도 못 데려가게 할게, 끝까지 널 안고 있을게, 원한다면 주인이 돼 줄게! 제발 날 다시 안아줘... 내 곁에 있어만 줘... " -
287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전 10:52:21>>286
주인의 울음 섞인 본심을 들으며 쓰디쓴 미소가 입꼬리에 감겼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반투명해진 손끝으로 닦아주려했으나 불가능하단걸 깨닫곤 멈칫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특별한 인연에 집착한다는 점이었소. 이렇게 나를 붙잡는건 주인이 처음이 아닐세. 다른 이들과도 좋은 연을 맺었었지만, 그게 다였소.”
팔까지 반투명해진 자신은 이제와서 주인을 안아줄 수도 없다. 그 점을 명확히 알고있기에, 그저 끌어안아진 채로 주인의 머리를 반투명한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슴이 술렁이는 것은 처음이오. 그 어떤 인간과 헤어져도 잠깐의 아쉬움만 남던 내가, 주인을 만나 처음으로 깊은 미련에 몸부림치고 있소. ……알지않는가, 난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네.”
반투명한 영역의 확산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의 몸은 마치 별무리처럼 변해가며, 해질녘의 호박색 빛이 섞여들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내보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반투명해지기 직전인 자신의 입술을 가리킨다.
“입을 맞춰주게. 주인의 의지로. 또 한 번, 우리가 처음 만나 계약하던 날처럼.” -
288 이름 없음 (3151285E+5) 2018. 7. 15. 오전 10:59:12>>287
불안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왔고, 붙잡은 이도 한 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어쩌면 결국 훌쩍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다시 혼자? 너무 힘들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야.
" 무엇이든 좋아... 함께하고 싶어. "
널 끌어안고 옷의 앞섶에 고갤 파묻고, 꼴사납게 울었다.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혼자 남는 것 보다는 나아.
" 응... 기꺼이. "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걸까.
마지막이 될 지 모를 입맞춤, 어깨에 팔을 두르고 발꿈치를 들어 사라져가는 입술에 댄다.
반드시 붙잡고 말겠다는 듯이.
" ..... "
그친 줄 알았던 눈물방울이 또 흘러내린다. -
289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전 11:13:08>>288
“그렇게 금방 바스라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 치사하게도.”
주인이 그의 입에 입을 맞춰줄 때까지 주인의 얼굴을 죽 바라보았다. 눈과 귀, 코, 입. 나는 대체 이 주인의 어느 점에 끌렸던 것일까. 그 이유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목에 팔을 얽고 입을 맞춰올 때, 이렇게까지 가슴팍의 격렬한 고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진행되던 반투명화가 멈췄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나는 판단했네. 주인, 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영겁과도 같은 시간을 바쳐도 될 것이라고. 나의 모든 힘과 명예를 잃고, 그 외에 남은 나의 모든 걸 주인에게 바치겠네.”
눈을 마주치고,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나즈막이 웃는다.
“사랑하네.”
그 말을 시작으로 청년의 몸에서 수많은 기운들이 육체를 벗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방대한 기는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며 밤하늘을 타고 올라간다. -
290 이름 없음 (3151285E+5) 2018. 7. 15. 오후 12:08:32>>289
" 미안해, 이런 나 때문에... "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다니.
역시 욕심이 아닐까, 오랜 시간을 보내며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은 너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닐까.
사랑이라는 말로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
" 나도 모든 걸 너에게 바치고 싶어. 보잘것없고 허세뿐인 여자아이지만. "
네가 좋아해준다면 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어.
" 사랑해! "
진짜 사랑해!
그렇게 소리치며 청년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에 청년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고.
다시금 입을 맞추었다.
천천히,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되기를 소원하면서. -
291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후 1:19:21>>290
“미안해하지 마시오. 이것은 내 선택이자, 주인의 선택이기도 하니. 주인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으면 하오. 내게 있어 주인은 그 어떤 누구보다 특별한 이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휘감듯이 읆조렸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청년을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기운이 점점 소멸되어가고, 반투명한 부분들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한다.
“인간이란건……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었는가.”
자신을 끌어안은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따듯하고, 보드랍다. 계약은 끊어졌으나 이어짐을 느낀다.
입맞춤의 끝에 기다리는건, 인간이 된 청년이었다. 청년은 어색하다는 듯이 자신의 몸을 둘러보고 있다.
“어딘가 이상한 부분은 없는가, 주인이여.” -
292 이름 없음 (3151285E+5) 2018. 7. 15. 오후 2:35:20>>291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에 너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특별한 이라는 말이 가슴 속에 울린다, 고맙고 미안해.
아, 네 모습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이제는 떠나지 않는 거구나.
" 전혀 없어! 닿는 감촉도 선명해졌고. "
나는 손을 뻗어 네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인간이 된 너의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꽤 좋았다.
"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
나는 널 향해 팔을 벌렸다.
지금까진 내가 안았지마는, 이젠 누군가가 날 안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뛴다.
" 안아줘. "
눈물이 지나가 붉어진 눈을 깜빡인다. -
293 이름 없음 (7512528E+5) 2018. 7. 15. 오후 3:36:02>>284
음, 귓가에 무어라 웅웅거리는 소리가 친숙한 듯도 싶고, 낯선 것 같기도 했다. 뺨이 핥아지는 감각에 잠결에도 옅은 미소가 걸린다. 내 강아지가 나를 깨우려나 보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더 자고 싶은데.
"조금만 더 자자..."
명백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웅얼거린다. 그리고 습관처럼 품에 머무는 온기를 다정하게 토닥였다. 그 온기의 크기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잠이 덜 깬 탓이겠지, 꿈으로 도로 끌려가는 정신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채듯 주인님? 주인님? 연신 누군가를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고, 목덜미에 닿는 간지러움에 눈을 가늘게 뜨자 응당 보여야 할 제 귀여운 강아지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소년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닌가! 화들짝 놀라 소년에게서 떨어져서 크게 뜬 눈을 연신 깜박이다가 표정을 굳힌 후에 약간 경계어린 목소리로 묻는다.
"...누구?"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다. 침대 근처, 하다못해 침실 안에 있어야 할 내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미간을 구겼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내 애완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나 이런 스토리 좋아해! :> 외딴 산골짜기에 편히 살려면 마녀가 좋겠지? 모종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둔 게 있니? -
294 이름 없음 (3378374E+5) 2018. 7. 15. 오후 3:45:51>>292
손과 손이 맞닿으며 느껴지는 감촉에 배싯 웃으며 깍지를 껴 마주잡았다. 주인의 안도와 기쁨, 그 외 복잡한 감정들이 온기를 타고 전이된다. 그렇군, 나 역시 안도했어.
안아달라는 말에 발을 살짝 앞으로 당기고, 허리를 굽혔다. 팔을 벌린 주인을 향해 양팔을 뻗어 꼭 끌어안았다. 다신 놓을 일이 없을 것처럼, 강하게.
“책임을 져주어야하네, 주인. 난 이제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말이오. 책임지고 날, 사랑해줄 수 있겠는가?”
주인의 목에 코를 작고서 입을 연다. -
295 이름 없음 (3151285E+5) 2018. 7. 15. 오후 4:10:29>>294
아, 포근한 감각이다.
네가 날 꼭 끌어안자 느껴지는 온기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린대도 좋아.
" 맡겨줘, 엄청 사랑해줄테니까! "
네가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날 위해 남았듯이, 난 모든 것을 바쳐 너를 사랑할 거야.
" 사랑해. "
-
296 이름 없음 (8806339E+5) 2018. 7. 15. 오후 10:29:57>>293 많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바쁜 일이 있었거든.. 집 가서 정리하면 내일까진 쭉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좋아한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이어줘서 고마워! :)
인간으로 변한 모종의 이유라면, '마녀가 실험중이던 약을 호기심에 먹게 되어서'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
현재 소년의 설정은 자신이 인간이 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주인님, 좋아, 싫어, 배고파, 산책 가자 등 기본적인 의사 표현만 할 수 있다는 정도야.
혹시 더 구체적으로 짤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 해주고, 얼른 들어가서 이어올게! -
297 이름 없음 (7512528E+5) 2018. 7. 15. 오후 11:05:19>>296 괜찮아! 느긋하게 이어가자. 나도 별일 안 생기면 내일 쭉 있을 수 있을거야 ㅎㅅㅎ
취향의 소재라 잇는 동안 즐거웠구, 혹시 다른 레더가 이을까 잇는 동안 살짝 전전긍긍 했어 ㅋㅋㅋ 앗. 그 이유도 마음에 든다! 다른 마녀(혹은 마법사)의 마력이 안 느껴져서 대체 내 강아지가 왜 변했지??? 혼란에 빠져 있다가 실험실? 에서 깨진 병이라든가 ㅋㅋ 어질러진 책상에 줄어든 약 보구 아.. 허탈하게 깨닫는 것도 좋겠다.
인간이 된 거 인지 못 하는구나! 귀엽다ㅋㅋㅋㅋ 꼬리 없어진 거 눈치채면 본인이 인간이 된 거 인지할까? 몇 살쯤일까? 견종두 궁금하다! 눈은 까만색일까? 혹시 생각해둔 강아지 소년 이름도 있어? :3 (feat.물음표살인마) 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면 마녀가 강아지랑 보낸 세월이 몇 개월(혹은 몇년)쯤인지랑, 마녀랑 강아지의 첫 만남 정도일까? 마녀 설정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줘. 밤이니 조심히 무사하게 돌아와 :) 잇는 건 천천히여도 좋아. -
298 이름 없음 (5376326E+5) 2018. 7. 16. 오전 12:28:45>>297
놀란 듯이 거리를 두는 주인을 멍하니 바라보던 소년은 왼손을 가볍게 말아쥐고 제 눈가를 몇 번 쓸어내렸다. 그래도 제 주인의 얼굴을 본 것이 마냥 기쁜 듯, 이내 그는 말간 미소를 띠며 여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주인님, 나야!"
소년은 품에 안긴 채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여인의 눈에 비친 소년의 모습(머리색과 눈 색)은 그녀가 아끼던 강아지의 그것(털 색과 눈 색)과 닮아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윽고 당황한 기색을 느낀 소년은 폭신한 침대를 짚은 그녀의 손등을 불안하다는 듯이 두어 번 핥고는 희고 가녀린 손목에 제 뺨을 부비었다. 어딘가 간절하게.
...
약 2년 전, 갓 태어난 강아지가 눈도 뜨지 못했을 적에, 그 작은 새끼 짐승은 풀이 무성한 바위 밑에 숨겨져 있었다. 녀석이 꿈틀꿈틀 바위틈으로 기어 나와 겨우 뜬 눈에 처음 담은 것은 어느 여인이었고.
주위의 들풀에 핏자국이 무성한 와중에 작은 강아지는 잘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끔벅이며 새까만 눈동자로 저를 안아 든 여인을 애써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 그 품 안은 녀석이 그녀를 제 어미로 착각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 견종은 하운드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뒤의 질문은 조금 설렁설렁 풀었지만 답레에 적어놨구, 이름은 주인님이 지어줬으면 해!.. 햇수로 따지자면 열 네 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꼬리가 없어진 걸 알게 된다면 엄청 당황하면서 주인님에게 캐묻고 달라붙지(?) 않을까 싶어! 강아지 귀가 있고 없고는 너레더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너레더가 말해준 에피소드도 이상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해해주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늦었지만..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
299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전 1:29:04>>298
모르는 인간 소년이 말갛게 웃으며 허리를 껴안는다. 당혹스러워 몸을 움찔거렸지만 그를 뿌리치진 않았다. 성인 남자였다면 발로 차버렸겠지만, 이 애는 아직 어린 것 같고 또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
아까부터 찾던 주인님이 혹시 난가??? 나야 나 사기도 아니고, 대뜸 주인님 나야! 하면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얼떨떨함을 숨기지 않고 품에 안긴 이를 내려다 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 싶더니 머리카락 색도 눈동자 색도 많이 본 색이다. 내 강아지 로키의 색과 똑 닮았다. 손등을 핥고 손목에 뺨을 부비는 행동조차 로키를 연상시켰다.
"..로키?"
어딘가 간절하게,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소년을 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싶은데. 아무래도 이 소년. 내 강아지인 것... 같지?
-
2년 전 쯤의 일이다. 금발의 마녀가 새카만 눈동자의 강아지를 만난 것은. 피냄새가 훅 풍기는 곳을 그냥 지나쳐 가려다 발을 멈춘 것은 아마도 어리디 어린 짐승을 만나기 위함이었으리라. 죽음의 냄새가 맴도는 곳에서 겨우 살아있는 생명을 품에 조심히 안아 들었다. 내버려두면 죽겠지 싶어서 조금만 클 때까지 보살펴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애를 데리고 왔다. 그 조금만, 조금만 더가 어느새 이년. 그녀는 여전히 강아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강아지 이름 지어주려고 한참 고민했어 ㅋㅋㅋㅋ 답변 고마워! 레스 안의 풀어진 이야기6도 레스 밖의 대답도 즐겁게 읽었어. >-< 꼬리랑 귀는 세트인 게 좋아서 ㅋㅋㅋ 꼬리가 없어졌다면, 귀도 없어진.. 아니 귀도 사람 귀로 변한 걸로! 과거는 일부러 3인칭으로 썼는데 마녀 눈색이 묘사를 못했어ㅋㅋ 마녀는 반짝반짝 부드러운 레몬금발에 달콤한 체리레드색 눈동자를 가졌어. 오늘은 이만 자야할 것 같아. 잘자! 좋은 꿈 꿔!
나도야! 나도 계속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 -
300 이름 없음 (5376326E+5) 2018. 7. 16. 오전 2:44:11>>299
'..로키?'
"응!"
여인의 품에 안겼던 응석둥이 소년은, 제 이름을 듣고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돌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전 같았다면 장난스레 달려드는 강아지에게 못 이기는 척 부러 쓰러져줬을 그녀였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양어깨를 붙들어 밀치는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다.
"좋아해."
로키라 불린, 얼마 전까지 강아지였던 소년은 제 주인의 배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앉은 채로 반갑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뺨을 마구 핥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고, 그는 입술 새로 빨간 혓바닥을 빼꼼 내밀고서 만족스런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 로키... 정말 마음에 들어! 주인님이 한참 고민했다니 더 감동인 걸 ㅠㅠ!! 반짝반짝 레몬금발, 달콤체리 눈동자(!) 마녀님은 황홀하구나... 히히.
동물 귀랑 꼬리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마녀주는 둘 다 있는 편이랑 둘 다 없는 편이랑 어느 쪽이 좋아? 맞춰서 갈게!
나도 답레 읽으면서, 쓰면서 정말 즐거웠어! 이런 감정 오랜만에 느껴. 정말 고마워! 덥지 않게 잘 자고 예쁜 꿈 꿨으면 좋겠다. 내일 또 봐! :3 -
301 이름 없음 (8795427E+5) 2018. 7. 16. 오전 8:15:25>>276 나 급하게ㅜ해외 출장 갈 일이 생겨서 ㅠㅠ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미안해 ㅠㅠ 분위기상 내가 막레를 쓰면 될까..?
-
302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전 10:26:48>>300
응! 이라는 대답이 멍! 으로 번역되어 들렸다. 몸을 일으켜 달려드는 소년의 힘에 못이겨 몸이 뒤로 넘어갔다. 그에게 양 어깨를 붙들려서 버틸 재간이 없었다. 아, 침대가 크고 푹신해서 다행이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킨다.
"..."
좋아해, 너는 항상 내게 그렇게 말해온걸까. 마음이 뭉클해지기 무섭게 소년이, 아니 로키가 뺨을 마구 핥아온다. 아니, 잠깐, 멈춰 봐... 혹여 위에 올라탄 소년이 다칠까봐 크게 반항도 못하는 그녀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로키. 이제 그만. 제 말을 알아들은건지 아닌지. 인간이 되어버린 로키가 혀를 빠끔 내밀고 만족스레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마주 미소지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하기도 했다.
"착하지, 로키. 이쪽에 앉을래?"
누운 채로 한 손을 넓게 뻗어 그 자리를 툭툭 가볍게 치며 배 위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 아, 역시 침대가 넓어서 다행이지.
//마음에 들어해줘서 기뻐 ^///^! 흑흑 로키도 로키주도 넘 귀여워..! 예뻐보이고 싶어서, 달콤한 색들로 정해봤는데 너레더 취향에 맞출 걸 그랬다 싶기도 하구;ㅅ; 음, 음.. 마녀 키는 너레더 취향에 맞출래!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아니면 적당한 거?
앗... 결정장애 온다. 있어도 없어도 좋은데... (고민) 수인이 있는 세계관(+수인복지가 잘 되어있는 세계관)이면 귀랑 꼬리가 있어도 좋지만, 수인이 없는 세계관이면 귀랑 꼬리 없는 걸로 하자!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둘이 같이 사람들이 마을로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로키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니까. 마녀는 얼마든지 이상하게 쳐다봐도 되지만, 로키는 안 돼! >:3 (랜선로키맘)
오랜만에 느꼈다니.. 8ㅁ8 왠지 맘이 찡해.. (부둥부둥)(둥개둥개) 사실 더위 탓인가 새벽에 눈 떠버려서 ㅋㅋㅋ 어장에 답레 올라온 거 보고 더위고 뭐고 새벽부터 기분이 좋았어.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레더도 간밤에 좋은 밤이 되었길, 또 좋은 아침이 찾아왔기를 :) -
303 이름 없음 (3784376E+5) 2018. 7. 16. 오후 12:41:14>>301 에고 그랬구나ㅠㅠ 응응 부담갖지 말구 편하게 주었으면 해8-8 출장 잘 다녀오구 볼 수 있다면 막레로 다시 보자!
-
304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12:50:43>>302
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년을 타이르자 폭신한 침대가 가볍게 흔들렸다.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뉘이던 소년은, '응!' 하고 가볍게 대꾸하며 배 위에서 호다닥 내려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마냥 좋다는 듯이 천진한 미소를 띠며 제 주인의 반짝이는 체리 색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좋아!"
소년이 느긋하게 제 눈가를 부비던 손을 동그랗게 말아 여인의 콧잔등에 살풋 올려놓으며 작게 외쳤다. 이내 소년은 그 손을 거두고서, 몸을 웅크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핥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하얀 손등에 박혀 있었다.
//마녀주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구나! 읽다 보니 기분이 몽실몽실해져. :3 나는 덕분에 잘 잤어. 그런데 새벽에 깼다니.. 괜찮아? 피곤하겠다.. 사실 나도 오전에 잠깐 어디 좀 다녀오면서 답레 올라온 것 보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 밖에서 혼자 헤실헤실 웃었다니까.. ㅋㅋㅋ 그 때문에 답레가 늦긴 했지만 ㅠ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 달콤한 색 정말 좋아해! 따뜻한 동화 같잖아? 마녀님 내 취향이야. 힐링 될 것 같아 :> 음음, 마녀님 키는 작지는 않았음 좋겠다! 지금이야 소년이 마녀보다 훨씬 작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되는(?) 역키잡.. 해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귀랑 꼬리는 없는 게 낫겠다! 마녀주 말 들어보니 이쪽이 좋을 것 같아서. 랜선로키맘ㅋㅋ♥
부둥부둥 좋아, 둥개둥개 좋아! 뭐라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조금 곰손이긴 하지만 이제 일 다 마쳤으니 내일 저녁까진 텀이 길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느긋하게 이어줘! :)
(본문보다 이게 더 길어.. ㅠㅠㅋㅋㅋㅋ!!) -
305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1:39:26>>304
내 강아지, 말도 잘 듣지.
마냥 천진하게 웃는 게 귀여운데 꼭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 하루 아침에 강아지가 사람이 된 까닭이 있겠지 싶어서 마력으로 소년을 훑었다. 누군가의 장난질인가 싶었지만 타자의 마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로 보아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끙,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앓는 소리를 속으로 삼키고선 몸을 일으켜 앉아 소년과 마주보았다.
"...나도 로키가 좋아."
열네 살 남짓일까? 소년의 나이를 어림잡아 본다. 조금 자라도 여전히 내게는 어린 강아지라서 인간으로 변한 모습이 새삼스럽다. 생각보다 많이 자랐다. 낯설고도 친숙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있으려고 했지만 콧잔등에 말아쥔 손을 올린다거나 웅크려 손가락을 핥는 재롱에 넘어가 눈을 접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맑고 선명한 웃음소리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 어떻게 변하든. 너는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니까.
핥는 손은 그대로 내어주고, 빈 손을 들어 소년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애정이 담긴 손길로.
//하루 정도는 적게 자도 괜찮아 :3 로키가 힐링해줘서 피곤하지도 않아ㅋㅋㅋ 로키도 내 취향이야. 난 지금 랜선집사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 ^ㅁ^ㅋㅋㅋㅋ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u.u 그럼 마녀 키는 168,9 정도 할까? 적당히 키가 크고 시원스레 보기 좋은 몸선이 뻗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가늘가늘, 낭창낭창, 여리여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느낌! 사실 내가 소년키 알못이라 한 145쯤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균키 찾아보고 놀랐어 ㅋㅋㅋ 로키주가 생각하는 소년키는 얼마 정도야? 나도 지금은 마녀님 키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키가 따라잡는 게 좋아! 나 역키잡 좋아햌ㅋㅋㅋㅋ 내 취향을 어뜩케 알았찌??? (찔림)
나도 잡담 너무 길어진닼ㅋㅋㅋ 로키주랑 수다 떠는 게 즐거워서 그런가봐 ^~^ 나도 실은 곰손이야ㅋㅋ.. 응응, 느긋하게 이을게. 로키주도 편하게 이어줘 ;) -
306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2:18:00>>305
여인의 애정어린 손길에 소년은 그것을 더 갈구하듯이 눈을 감고 황홀한 표정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꿈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평온한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만이 귀를 간질일 때, 별안간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것은 흔한 일이었고, 소년은 당연하게 '누구야?' 하고 짖듯이 외치며 침대를 박차고 창가 쪽으로 뛰어나갔다.
"아야!"
우당탕,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평소처럼 침대에서 뛰어내렸을 뿐인데, 인간으로 변한 것을 알 턱이 없었던 소년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끄응- 하는 아픈 신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틀에 손을 짚고 그 밖을 향해 몇 번이고 짖어대기 시작했다.
"야! 뭐야! 누구야?"
벽을 짚고 섰을 강아지의 눈엔 창밖이 보이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높다란 산봉우리 뒤에 걸려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과 몽실한 구름이 군데군데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었다.
산짐승의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자 소년의 목소리도 잦아들었고, 소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주인을 돌아보다, 침대에서 떨어질 적에 손목을 접질렸는지 한쪽 팔을 들고 바르르 떨며 몇 번이고 핥았다.
//예쁘게 말해주니 기쁘고 다행이지만 무리는 하지 말아! 오늘 진짜 더워 ㅠㅠㅋㅋㅋ
앗 ㅋㅋ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키야! 혹시 내 생각 가져갔니..? 사실 나도 키알못이라.. 130~140 정도 생각했었어. 뭐.. 애초에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쑥쑥 커갈 거니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급전개인가? ><.. 나중에 덥수룩한 소년의 머리를 마녀님 입맛에 맞게(?) 잘라주는 상황도 재밌을 것 같아! 방금 생각났어..ㅋㅋ 조금 늦었지만, 점심 챙겨 먹고 시원하게 지내!! -
307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2:51:46>>306
사냥꾼인가.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이곳까지 도달하지는 않겠지만, 적당히 먼 곳에서 희생당했을 산짐승이 가여웠다. 침대를 박차고 나간 제 강아지가 굴러 떨어져 어딘가를 다치기 전까진 말이다.
"로키?!"
보는 것 만으로도 제가 더 아픈 것 같다. 바뀐 몸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까. 강아지일 적에는 다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지금 로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픈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바르르 떨고 있는 손을 핥고 있는 로키에게 조심조심 다가갔다. 힐, 작게 읊조리며 소년의 손목을 감쌌다. 마녀의 손바닥 아래에 생긴 푸른 빛무리가 소년의 손목을 타고 맴돌다가 온몸으로 훑고는 사라졌다. 아픔도 고통도 씻은듯이 가셨겠지만.. 음..
"저, 로키. 너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까? 더없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걱정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마녀의 달콤한 눈동자에 걱정과 애정이 섞여 아롱거렸다. 몸집은 소년이어도 하는 행동은 강아지고 내가 하는 말은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본인의 언어구사 수준은 유아에 가깝던데.
"거울.. 보러 가볼래?"
말로 설명해주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빠르겠지. 거울에 강화마법을 걸어야겠다. 혹여 깨지면 로키가 또 다칠까 무섭다. 마녀는 소년을 공주님 안기로 조금(??) 힘겹게 안아들었다. 끙, 역시 강아지일 적보단 훨씬 무거워졌다. 마녀는 얼른 제게 튼튼마법을 걸고 전신거울이 있을 제 드레스룸으로 걸어갔다.
//앗.. 나도 첨엔 140 생각했어 ㅎㅎㅎ 평균키보고145로 올려적은 거야. (수줍) 그럼 140 정도로 할까? 로키야 ㅋㅋㅋ 얼른 아니, 천천히 쑥쑥 크렴.
아니! 나도 진전을 원했어 ㅋㅋ 급전개 아니야. 거울봐도 자기를 못 알아볼 것 같긴 하지만 ㅋㅋㅋ (귀 꼬리가 없음=나 아님..?) 로키 반응 기대 된다! 앗.. 나도 처음에 덥수룩한 머리보고 머리 잘라주는 생각했었는데! 로키주야말로 내 생각 보고왔니?? 응, 로키주도 식사 잘 챙겨먹구 시원하게 지내ㅠㅠ! -
308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3:20:54>>307
소년은 핥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오는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아프고, 더 큰 아픔이 두려워 그녀가 뻗는 손을 피해 몸을 웅크렸다. 손목에 그녀의 손길이 닿았을 때에 팔을 타고 뻗는 고통에 몸을 움찔거렸으나, 이내 그 고통은 온몸을 훑는 빛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아픔이 사라진 소년은 신기하다는 듯이 손등을 핥더니 그 손으로 제 얼굴을 몇 번 훑어내렸다.
"안 아파!"
서글프게 찡그렸던 얼굴은 다시 해맑은 미소를 되찾았고, 소년은 여인을 향해 기쁜 소릴 내었다. 당연하게도 소년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고맙다는 듯이 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발등을 핥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저를 안아 들기 전까지는.
"주인님, 주인님! 무서워! 내려 줘!"
겉모습은 사춘기 즈음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그 속은 아직 어린 강아지이기에 침대보다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무서워했다. 소년은 여인이 저를 안아 들자 몸을 굳히고 끼잉- 하는 소릴 내더니, 품에 안긴 채로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여인의 품 안에서 눈을 꼭 감은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응! 140 딱이다 ㅋㅋ 강아지를 직접 키운 건 아니고 자주 봐서 그런가.. 이입하려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닼ㅋㅋㅋ 덕분에 힐링 너무 잘하고 있어 ㅠㅠ! 공주님 안기 ㅋㅋ 튼튼마법 너무 귀엽자넠ㅋㅋㅋㅋㅋㅋ
설정 미스까진 아니고... 주인님, 좋아 등의 표현을 사람 말로 할 수 있는 건 약의 효과라고 해도 될까? 그 이외의 단어는 조금씩 배워가야 할 거고.. 응! -
309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3:49:53>>308
서글픈 얼굴이 미소를 찾은 것은 좋으나 발등을 핥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으, 아.. 얼굴이나 손등까지는 괜찮았는데. 강아지가 발이나 발등을 핥을 때는 귀엽다는 것 외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핥지 말라고 해야할까..?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조곤조곤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인다.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한 것을 아무래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지. 밥, 산책, 돼, 안 돼.. 이런 것은 알아들을 것도 같은데.. 눈 꼭 감고 바들바들 떠는 게 영락없이 강아지 모습일 때랑 겹쳐보여서. 그녀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내리려고 애쓰면서 걸어갔다. 드레스룸 문을 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몸을 낮추고 소년을 조심조심 내려주었다.
"자, 이제 눈 떠도 돼."
//주인님이 지금은 28,9센치정도 크겠네! ^~^ 딱 좋다. 난ㅋㅋㅋㅋ 강아지가 높은데 무서워하니까 공주님안기 상태 그대로 쭈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전진하는 마녀님 쓰려다 자제했어 ㅋㅋㅋㅋ 난 이입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개그랑 현대말투(??) 써지려고 해서 곤란하다.. ㅋㅋㅋ 안 돼.. (아직은) 마녀 이미지 지켜줘야 해.. (심호흡)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텐데 댕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응 좋아! 모처럼 자기 감정 표현 정도는 제대로 하고 살아야지! 아는 단어들도 있겠지? 지금 마녀가 생각하는 밥(맘마), 산책, 돼, 안 돼. 기다려. 착해. 귀여워... 같이 강아지일 때 많이 들어봤을 단어나 짧은 문장들 말야.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했으면 좋겠어. ㅎㅅㅎ -
310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3:54:11모처럼 뒤에 '인간이 되었는데' 적으려고 했는데 왜 빠졌지.. (쥐구멍) 거울은 커다란 전신거울이야! 아마 로키가 어른이 되어도 제 모습을 다 비출만한 크기!
-
311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4:20:31>>309
소년의 발이 먼저 바닥에 닿았다. 소년은 마치 강아지가 부러 뒷다리로 서듯이, 허리는 약간 앞으로 굽은 채 양팔을 접어 가슴께에 붙인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위태롭게 휘청이며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다. 지금의 몸은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옅은 신음소릴 내며 겨우 눈을 떴을 때,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낯선 사람이었다. 제 주인과 같이 두 발로 섰는. 그것도 바로 코앞에 있었기에 더욱 놀라 '누구야, 누구야!' 하고 짖으며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다.
"아? 우? 주인님?"
소년은 한 걸음도 채 떼지 못하여 등 뒤에 서 있던 여인에게 가로막혀 움찔거렸고, 그녀를 돌아보며 맹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거울 쪽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놀라 당황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상대방(거울 속 자신)이 적의가 없다는 것을 겨우 알아차린 소년은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기도 했고, 지금은 손이 되어버린 자신의 앞발로 거울을 툭툭, 쳐보기도 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닠ㅋㅋㅋ 오리걸음 뭔뎈ㅋㅋㅋㅋㅋ 개그코드 진짴ㅋㅋ 마녀주 너무 재밌어 ㅠㅠ! 우리가 머 시리어스 굴리는 것도 아니구. 힐링힐링물인 것 같은데 아무렴 어때요! ><
응. 댕댕이(?)는 당연히 반복적으로 들었던 단어들은 기억하고 반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알아듣는 말도 꽤 많겠지만, 아직까지 저 자신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겠지?
그나저나 나중에 주인님이 자세 교정(?) 좀 시켜줬음 좋겠다... ㅋㅋㅋㅋ 똑바로 서라곸ㅋㅋ 최대한 몰입해서 '이렇겠구나' 하고 쓴 거긴 한데 너무 바보 같아...ㅋㅋㅋㅋㅋㅋ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인지하는 건 한 두 레스 안으로 마쳐볼게! -
312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4:58:26>>311
강아지 모습으로 하면 재롱이지만 사람 모습으로는 어정쩡한 개흉내가 되어버리네. 음, 곤란하고 곤혹스러웠지만 로키는 제 심정보다 더한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세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녀는 소년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한 것 같다. 거울을 깰까 잽싸게 강화 마법을 걸었다. 원숭이나 원숭이과의 동물은 대체로 하루도 못 되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저인줄 아는 것 같던데 개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 내 강아지는 똑똑하니까 빠르겠지..? (모든 엄마는 자기자식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음, 그나저나 자세가 참... 신경이 쓰인다.
"자, 로키. 똑바로 서 보자."
로키의 뒤로 다가간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걷고 있다. 로키의 뒤에 멈춰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들어올리며 소년을 바로 세워 보려고 노력했다.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고 백허그 비슷한 상태니 넘어져도 다칠 순 없겠지만.. 음.. 똑바로 서는 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걷는 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있어도 사람의 아이를 키운 적이 없는 마녀는 곤혹과 혼돈의 늪에 빠질 것만 같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차근차근해서 알기 어렵겠지만.
"괜찮아. 힘주고 버티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어."
음.. 아무래도 나는 육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겉은 사춘기..? 정도의 소년인데 속은 작은 강아지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커져간다. 진짜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곤혹스러움과 당혹과 시무룩함과 떨어져가는 자신감을 제 안으로 감추며 마녀는 생글생글 상냥한 얼굴로 웃으며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해보았다. 웃는 얼굴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은 엄한 얼굴로 해야.. 겠지?
//마녀님은 육아가 낯섭니다.. ㅋㅋㅋ 인간의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ㅋㅋㅋㄱ^~^ 겉은 사춘기소년인데 속이 어린 강아지라 괴리감이 크다 ㅋㅋㅋ 앗, 웃어줬다면 기뻐! ㅋㅋ 힐링물로 시작했는데 마녀와 나는 왠지 육아물을 찍는 느낌이얔ㅋㅋㅋㅋ 도와줰ㅋㅋㅋ 육아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어훜ㅋㅋㅋㅋ 응응, 알아듣는 말이 많을수록 (나와 마녀가) 좋겠지..! 행동.. 하니까 생각나는데 핥는 거 못하게 하면 서운해할까? (마녀는 몰라도 내가 서운할.. 지도.. ㅋㅋㅋㅋ) 응응! -
313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5:12:14아아... 괴리감 ㅋㅋㅋㅋㅋ 안되겠어.. 묘사하자니 나까지 이상해질 것 같앜ㅋㅋㅋ 조금 많이 비약되고 이전보단 짧겠지만 얼른 답레 가져오도록 할게! 정상적으로(?) 마녀님한테 응석 부리고 싶어..><
-
314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5:50:38>>312
뒤에서 소년을 감싸 안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돌쟁이 아기에게 첫걸음마를 가르치듯 부드럽고 다사로웠다. 맞은편의 사람은 제가 눈을 깜박일 때마다 똑같이 눈꺼풀을 움직였고, 앞발을 내밀면 그 또한 손을 뻗어왔다. 제가 짖기라도 하면 동시에 그도 입을 벌렸고, 고개를 옆으로 뉘이면 그 역시 고개를 뉘였다.
소년은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마주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관찰했다. 구부정하게 있는 것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네 발로 서있을 때처럼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진 소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쥐었다 펴보기도 했고,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약의 영향이었을까. 인간의 모습이 되면서 지능도 약간 올라간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맞은편에 섰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저것이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제야 소년의 눈에 거울에 비친 주인의 모습이 들어왔고, 소년은 휘청이지 않고 똑바로 '사람처럼' 뒤돌아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주인님!"
고작 2년 뿐이었지만 평생을 네 발로 걸어 다니며 살아온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었기에 많이 혼란스러웠음에도, 그저 주인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이 기쁘고 기뻐서 그녀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모습은 제법 사람같이 보였다.
//으.. 무슨 다큐멘터리... 관찰일기... 쓰는 줄 알았어 ㅋㅋㅋ 조금 많이 이상하고 읽기 힘들겠지만 한 번만 봐주라... 히히.. 무슨 모글리도 아니고 처음 설정이 잘못됐엌ㅋㅋㅋ 어찌어찌 수습됐나..? 날이 더워서 더 그런가 혼미하다..ㅋㅋㅋㅋㅋㅋ
응! 이제 제법 사람 같아졌지만() 평소 습관은 남아 있을거야(아마)... 핥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서운해할 걸? 근데 사춘기 소년이 다 큰 처자를 막 핥는 건 좀 그렇긴 하네....ㅋㅋㅋㅋㅋㅋ..... 그건 그거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기도(야
쓰다 보니 생각보다 늦었네! ㅠㅠ 오늘 몇 번을 씻는지 모르겠다. ㅋㅋ 뽀송뽀송해져서 돌아올게! :> -
315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6:40:05>>314
아, 역시 배우는 게 빠른 것 같아. 이제 받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서 있다. 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며 겨드랑이에 끼워 그를 받춰주었던 손을 천천히 뺀다. 제 몸을 더듬어보던 소년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 보고 있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채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
"응."
사람처럼 뒤돌아 저를 주인님이라 부를 때 무언가가 크게 변한 것 같기도 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내 강아지'일 거라고 생각했건만,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은 언제가 '내 강아지'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쓸쓸하고 괴로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너는 강아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인간인 채로 성장하게 되는걸까?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 내 로키."
혼란함을 커다란 기쁨이 집어 삼키는 순간을 보았다. 단지 얼굴을 보는 것 뿐인데. 내 강아지는. 아니 이제는 내 소년이라고 해야 하나. 그 애는 더할 나위 없단듯 기쁜 표정을 짓고 제 품에 안겨들었다. 그 모습이 제법 사람 같아서 애틋하고 쓸쓸하고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은 가끔 심장을 아프게 한다. 그녀는 이따금, 강아지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순간들에 그랬던 것처럼 소년을 끌어안고선 그 정수리 위에 가볍게 입술을 눌렀다 뗀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변해가든. 너는 내게 내내 어여쁠거야."
언제나 내 강아지여도. 언젠가 내 강아지가 아니게 되더라도 그렇다. 그럴 것이다.
지금은 이 말을,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어여쁜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나도 정신이 혼미한가봨ㅋㅋ 글 분위기? 장르가 힐링이 됐다가 육아물이 되었다가 신파(??)가 된다... 자꾸 널을 뛴다. ㅇ<-<
그렇지만 로키주 글이랑 로키주 글 속에 로키를 보면 자꾸 엄마 미소를 짓게 돼 ㅋㅋㅋㅋ 큐트뽀짝함에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ㅋㅋㅋ 후후, 서운해 하는 것도 귀엽겠지! 다 큰 처잨ㅋㅋㅋㅋ (뿜) 지금은 사춘기 소년이지만 언젠가는 청년이 되잖아 ㅋㅋㅋ 지금..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림(??)이.. 아니 분위기(??)가 위험해진다구ㅋㅋㅋ 그치만 청년이 되어서, 주인님 당황하는 모습 보고 싶어지면 껴안고 뺨 핥.. 아주면 좋겠.. 아니, 좋을까? (횡설수설) (사심섞인 아무말)
모글리 뛰어넘고 사람이 된 건가! 앞으로의 전개를 위해선 이게 좋겠지. 평소습관이면 눈부비기랑 핥기 아무때나 안겨들기일까! 눈부비기랑 핥는 것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안겨드는 버릇은ㅋㅋㅋㅋ (고쳐주기 싫다아...)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응. 뽀도독 씼고 저녁도 잘 먹고 와! 나도 저녁 먹고 오거나 저녁먹고 씻고나서 올 것 같아. 이따 봐 :) -
316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7:44:53>>315
나는 처음의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안아 들었을 때 보았던 새빨간 눈동자, 살랑이는 금빛 머리칼. 그 품 안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꼈어요. 당신의 냄새를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눈동자,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온기, 똑같은 냄새. 그대로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따금 생각했어요. 당신과 같은 인간이 되고 싶다고. 당신의 곁에는 내가 있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미소지어 주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외롭다는 것을.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지금도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었어요. 나는 예쁨받는 것이 좋았어요. 그저 당신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행복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애완동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당신은 모르겠죠. 내가 어째서 인간이 되고 싶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되었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놀랄까 봐. 나를 버릴까 봐.
...
"주인님, 좋아해."
소년은 가만히, 가만히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걸 막레로 하고 다음 상황으로 건너뛰어도 괜찮을까? 갑자기 1인칭 뿜뿜해서 미안햌ㅋㅋ.. 3인칭으로 표현하려니 갑갑하기도 하고... 사실 감정표현이 너무 하고 싶었어...:> 아련아련 오글오글 너무 좋아....
진짴ㅋㅋㅋ 장르 이리저리 널뛰기 짱이야!(?) 응응. 뺨 핥는 정도는 수위에 어긋나지 않겠지?(야) ㅋㅋㅋㅋㅋ
저녁 든든하게, 맛나게 먹고! 찝찝이들 쪼까내고!(응... 개운하게 씻으라는 소리야 ><ㅋㅋㅋ) 이따 봐! :3 -
317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8:03:25>>316 (심정지)(삐이이)
앗 괜찮아. 너무너무 예쁜 막레 줘서 고마워 ㅠ//////ㅠ (행복) 다음 상황은 뭘로할까? 1인칭만 쓰는 것도 3인칭만 쓰는 것도 상황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난 혼용해서 쓰는 걸ㅋㅋㅋ 미안해 할 필요없어! 감정표현, 감정선 너무너무 좋다. 강아지 일때부터 짝사랑(??)한 것도 너무 좋고.. 그랬구나, 우리 강아지 8ㅁ8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흑흑흑)(감동)(주먹울음)
응, 그정도면 어긋나지 않을거야! ^~^ (야2222) 저녁은 맛나게 먹었어! 다만 설거지를.. 해야 해.. ㅋㅋㅠㅠ 다음 상황은 뭘로 할까? 며칠 후? 몇년 후? 마녀는 실험실에서 약 줄어든 거 보고 약간 충격과 혼란의 늪(ㅋㅋㅋ)을 해매다가 로키한테 다시 다시 강아지가 되고 싶냐고 물어볼 거 같아! 마녀 이름도 이제 슬슬 정해야겠지? -
318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8:33:46>>317
앗, 좋아해 줘서 고마워! ㅇ///ㅇ... 사실 이거 쓴다곸ㅋㅋㅋㅋ() 그나저나 마녀님은 왜케 자상하고 마녀주는 왜케 기여워? ㅋㅋㅋ 뒤늦게 심장 멎어버리잖아..! 음음, 그래도 감정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안심이야!(막판에 뒷수습 한 거면서(야야
이제 와서 다시 개처럼(?) 행동할 엄두가 안 나서.. 몇 년이나 지나버리면 마녀님보다 훌쩍 커져 있을 것 같고 ㅋㅋ 일생가 할 정도로만 시간이 지나있는 건 어때? 강아지 시절 습관은 장난식으로만 거리낌 없이 하는 정도로!
근데 나 이름 진짜 못 지어... 심지어 마녀님 같은 이름은 더더욱! ㅠㅠ ㅋㅋㅋ 소년이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으음 아무튼 설거지 고생하고..! 나도 빨래 마저 널고 잠깐 나갔다 와야해서.. 더운데 왜 ㅠㅠ나오라고ㅠㅠㅠㅠㅠ
조금 이따 돌아와서 갱신할게! 오늘 덕분에 종일 행복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따 봐!! -
319 이름 없음 (7299111E+6) 2018. 7. 16. 오후 9:11:03>>318
마녀가 자상한 건 둘째치고 마녀주는 귀엽지 않지만 로키는 큐트뽀짝하구 로키주는 큐트상냥해서 행복해´︶`
다시 개처럼에 뿜었닼ㅋㅋㅋ 일생가...? 한 일년 정도 후면 될까? 그 정도면 강아지는 열다섯쨜이 되어있겠구나. 마녀랑 로키 둘다 1년간 고생많이 했겠닼ㅋㅋㅋ 핥지 않기, 눈비비기 금지, 아무데서나 껴안지 않기.(다만 이건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닼ㅋㅋㅋ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후쯤에 아무데서나 껴안기 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껴안기 금지가 될 것 같구!) 인간은.. 원래 지켜야할 규칙 같은 게 많은 생물이야! (???)
그럼 마녀이름도 내가 지을게! ㅋㅋㅋ 지어달라할까 하다가 곤란해 할까봐 어제?부터 고민했었어. '이스'나 '아즈'가 애칭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스란, 아즈렐, 이스렐.. 고민고민하다가 '이스엘라'로 할까 생각중인데 로키주는 어때? 이스나 엘라나 어느 쪽으로 줄여 불러도 예쁜 이름 같아서.. 1년 후에 로키 키라든지 교육정도는 로키주가 정해줘! 희망사항이 있다면 로키키가 아직 마녀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닼ㅋㅋㅋ 한 10센티 정도 더 커있으려나..? 로키 최종키도 궁금하다! :D
응 ㅠㅠ 밤중에 보내기 싫지만 부디 조심해서 다녀와! 나도 로키주와 로키 덕분에 온종일 행복하고 즐거웠어 *´︶`* -
320 이름 없음◆WyDA1BitHA (5376326E+5) 2018. 7. 16. 오후 11:36:09>>319
쪄 죽을 듯이 더운 여름날의 저잣거리엔 수많은 인파가 복작였고, 와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회색 로브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었다. 그들이 이 더운 날에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능력 덕택이었으리라.
"아즈, 아즈. 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
소년은 가판대에 놓인 먹음직스런 꼬치구이로 손을 뻗었고, 그의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그를 가던 길로 잡아끌었다. 뿔이 난 소년은 몸을 홱 돌려 발꿈치를 들고서 그 주인의 목덜미를 살짝 깨물었다.
"안 사줄 거야?"
여인의 목덜미에 혀를 갖다 대던 소년은, 키득거리며 '이거 좋아했잖아, 주인님.' 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전히 두 사람의 손은 깍지를 낀 채였고, 주변인(다른 이)들이 보기엔 그저 짙은 색의 로브가 잠시 펄럭일 뿐이었다.
//나 다녀왔어! 그리고 멋대로 이어왔어..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거든..() 이 쯤 되면,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러 장난치는 수준일 거야....
고민해서 이야기 해 준 이름은, '이스'도 예쁘긴 하지만 '아즈'가 더 잘 붙어서! 그렇게 불렀어. '이스엘라' 예뻐!
지금은 마녀님보다는 조금 작지만 나중엔 185cm 정도까지 크지 않을까 싶어. 꼬옥 안아줬을 때 아즈의 얼굴이 로키의 가슴팍에 폭 묻힐 정도로.
으으 아무튼 갑자기 맘대로 이어와서 미안해! 그리고 좋은 밤 되었음 좋겠어! :>!! -
321 이름 없음 (9879493E+5) 2018. 7. 17. 오전 12:14:27>>320
로브 안쪽이 퍽 시원할 것이다. 쾌적한 온도 마법은 이런 날씨에 큰 도움이 된다. 아, 마녀라서 다행이지.
"안 돼."
길거리 음식 맛들이면 못 써. 입에는 좋겠지만 몸에 좋지 않아. 아이 어르는 투로 조곤조곤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럴때는 주인님에서 엄마가 된 기분이라 묘했다. 목덜미가 깨물림과 동시에 그녀의 잔소리가 멈추었다. 몸이 움츠러든다. ...이거 밖에선 하지 말랬잖아. 엄한 표정을 지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안 사줄거야."
한풀 꺽인 목소리로 고집스레 대꾸하고는 한숨을 옅게 내쉬었다. 로키. 이제 넌 어린 강아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나 놀리는 게 그렇게 좋니?"
누나라고 말하다니 양심도 없지. 하지만 바깥에서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다며 양심을 팔아본다. 그녀는 깍지 낀 손의 손가락을 몇 번 꼼지락 거리다 말았다. 응석쟁이인 건 강아지일 적부터 알아봤지만 이렇게까지 장난꾸러기로 자랄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로키는 장난꾸러기구나! ㅋㅋㅋ 마녀는 한숨쉬지만 마녀주는 넘 좋다! 야호~~~ ^///^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장난이 더 재밌긴 하지 ㅋㅋㅋ 이어와줘서 고마워! 선레 내가 쓸까? 아님 로키주가 쓸까? 한창 고민하구 있었는데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었구! ^~^ (신남)
앗.. 조금 차이나는 정도면 16섯살, 2년 지났다구 할까??? 이정도 나이가 중2.. 아니, 반항기긴 하구나ㅋㅋㅋ 아즈가 애칭이면 본명은 '아즈엘라'로 할게´︶`! 이스엘라든 아즈엘라든 둘 중 어느 것도 좋았는데 기왕이면 우리 로키주가 달라붙는다는 이름으로 하려구! :3 다 큰 로키의 키도 안아주면 가슴팍에 얼굴 묻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 혹시 내 취향 사전에 조사한거닠ㅋㅋㅋ 아냐, 이어와준 거 넘 좋아. ㅎㅎㅎ (신남222) 오는동안 계속 생각해주었다는 것도 감격스러운걸 (찌잉) 로키주가 들고온 레스 보면서 '요 장난꾸러기!', 하고 콧잔등 때리는 거 언젠가 적어보고 싶어졌어! >_< 로키주도 좋은 밤 되길 바라 :D♥ -
322 이름 없음◆WyDA1BitHA (5326093E+5) 2018. 7. 17. 오후 12:47:31>>321
"응! 좋아."
발랄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소년은, 여인을 놀리듯이 '누나' 하고 작게 덧붙였다. 그는 손을 맞잡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뒤로 걸었다. 맑게 웃는 그 표정은 짓궂기 그지없었다. 잠시 눈이 갔던 꼬치구이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제 장난에 곤란해하는 주인을 관찰하기 바빴다.
소년은 깍지낀 손을 자연스레 끌어당겨 여인의 손등을 느리게 핥았다. 원체 핥는 것을 좋아했고 아무 데서나 하던 그 습관을 고친지는 오래지만, 이쯤 와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녀의 반응을 즐기기까지 하는 듯싶다.
"누나! 나, 구경."
다른 사람 들으라는 듯이 말하던 소년은 깍지를 풀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오랜만에 하는 사람 구경에 심히 들뜬 탓에 소년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순간이었다. 그는 냄새로 주인을 찾을 수 있었겠고, 그녀는 마녀이기에 깊은 걱정은 않았겠지만.
소년은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눈에 담았다. 그중에도 소년의 눈길을 끈 것은 제 주인의 눈 색을 닮은 작은 머리핀이었고, 그녀가 소년을 찾았을 때에 그는 가판대 앞에 쪼그려 앉아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제는 편히 잘 잤어? 그랬으면 좋겠다! ᕕ( ᐛ )ᕗ
아즈! 아즈! 너무 좋아 ㅋㅋ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것도 좋아! 강아지 나이대로 라면 벌써 성년이 되고도 남았겠지만, 변하고부터 사람처럼 나이 먹는다는 설정을 붙여버리자!(야ㅋㅋ)
ㅋㅋㅋ 아즈가 로키 혼내면서 콧잔등 때리는 것도 보고 싶고, 로키가 뿔나서 집안을 어질러 놓거나 아즈를 깨물깨물 하는 것도 보고 싶어! ㅋㅋㅋ아 너무 좋아ㅠㅠ 아즈, 로키 어감도 좋아!
글 쓸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흐뭇한 거 있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좋아! 고맙고 고마워!♥ -
323 이름 없음 (9879493E+5) 2018. 7. 17. 오후 2:17:00>>322
"..."
좋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누나, 라는 놀리듯 부르는 말. 주인을 놀리는 게 좋다는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뺨이 옅은 분홍색으로 달아오른다. 아, 양심 아파... 깨물렸던 목덜미를 자국이 남았나 확인해보고 싶지만, 빤히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따끔해서 그녀는 요리조리 시선을 피하다가 제 손을 끌어당겨 손등을 느릿하게 핥는 것에 눈을 동그랗게 뜬다. ...내가 밖에서는 더더욱 하지 말랬잖아..
"..."
할 말 많은 표정을 지었지만, 깍지를 풀고 달려나가는 뒷모습에 침음을 삼킨다.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서야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제 목덜미를 감싸듯이 매만진다. 혹시나 싶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잇자국을 지우려고 (당연히 주위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치료마법도 걸었다. 사실 그녀는 사람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제 강아지가 사람 구경을 좋아하고 교육에도 필요할 것 같아 가끔 시켜주지만...
그래, 사실 난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아.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가 그 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돌린다. 제 강아지와 함께 있을 적엔 잘 보이지 않는 우울한 낯을 하고서 잠시의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우울함을 지워내고선 소년을 찾아 나선다. 머지않아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걸어간다. 소년은 가판대 앞에 쪼그려 앉아, 체리색의 작은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게 마음에 들어? 사줄까?"
// 잘 잤어! 그제보다 많이 잤어 :3 로키주도 잘 잤어?
응응, 변하고나선 사람처럼 나이 먹는 걸로 하자. 마녀는ㅋㅋㅋ 짐작 했겠지만 나이를 먹어도 모습이 변하지 않아...안 늙습니다. ^ㅇ^ 음, 그리고 묘사는 안 했지만 지금처럼 사람 구경을 할 때, 사람들과 있을 때, 사람과 만날 일이 있을 때는 눈색을 녹색으로 바꾼다는 걸로 하자!
로키 사실 비글이야?? ㅋㅋㅋㅋ 뿔나서 집 어질깈ㅋㅋㅋ 깨물깨물ㅋㅋㅋ 이걸 비글미라고 불렀던 거 같은뎈ㅋㅋㅋ 깨물리면 아픈 척 해보고 싶닼ㅋㅋ 기왕이면 피도 났을 좋겠다! 생각보다 세게 깨물어 버려서 주인 몸에서 피나면 로키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해! ^~^(야) ㅎㅎㅎ 나도 그래 ㅋㅋㅋ 흐뭇하고 행복해! 내가 더, 내가 더 고마워할꺼야! >:3 (꼬옥) -
324 이름 없음◆WyDA1BitHA (5326093E+5) 2018. 7. 17. 오후 3:23:42>>323
"응!"
소년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대로 뒤돌아 여인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한 소년은, 아까처럼 발꿈치를 들고서 그녀의 왼쪽 옆머리를 귀 뒤로 살짝 넘겼다. 그는 눈치를 보듯이, 반응을 살피듯이 눈을 굴려 녹색으로 변한 여인의 눈동자를 한 번 바라보곤, 다시 그녀의 금빛 머리칼로 시선을 돌렸다. 손에 든 머리핀을 조심스레 꽂아놓더니 그제서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똑바로 섰다.
"예쁘다!"
여인보다 조금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본 소년은 이가 보이도록 활짝 웃었다. 그러고는 주위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으며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좋아 죽겠다는 듯이 마구 부벼댔다. 행인들은 그들을 사이가 각별한 오누이로 보았을까,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으로 보았을까.
옅게 남은 우울함의 냄새를 맡아, 더욱 밝아지려 애를 써본다. 그녀의 빈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
// 아마 로키가 피 내면... 상상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걸? ㅋㅋㅋㅋㅋ 밖에 말고 집에 돌아가서 장난치는 것도 보고 싶고, 마녀가 진짜 화나서 로키 혼내는 것도 보고 싶고.. 조금 위험한(?) 상황도, 찌통 터지는 상황도 ㅠㅠ!! 다 큰 로키가 역으로 마녀님 지켜주고 안아주고 어... 응! ㅋㅋㅋㅋ 응.
않이.. 상상하면 끝도 없구나 이 조합.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많이 굴려보고 싶어! 근데 나 글이 자꾸 조금씩 새는 것 같닼ㅋㅋㅋㅋ 저건 16살 꼬맹이가 아냐... 왜 지 혼자 아련해지는뎈ㅋㅋㅋ
아즈주만 괜찮다면 1:1 스레 따로 세워보고 싶기도 해! 오래 보고 싶어서... :3 -
325 이름 없음 (9879493E+5) 2018. 7. 17. 오후 5:11:39>>324
...저한테 줄 선물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감동했다. 밖이 아니라면, 꼬옥 껴안아주었을지도.
"...네가 더 예뻐."
이가 보이도록 활짝, 그녀가 좋아하는 웃음을 지으며 먼저 손을 뻗어 힘껏 안아주는데, 도저히 따라 웃지 않을 재간이 없다. 품에 얼굴을 묻고 마구 부빗거리는 소년을 바라보는 마녀의 눈동자에 애정이 고여 충만했다. 주위에 몰리는 시선도,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잠시 잊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잠시 두고보다가 큼큼, 헛기침을 하며 계산을 하라 눈치를 주는 주인에게 그녀가 잠시만 더 기다려 달라고 손짓해 보였다. 로키의 등을 몇 번 도닥여주고 포옹을 풀었다. 계산을 마치고 포장해 드려요? 묻는 주인에게 그냥 이대로 하고 가겠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가판대를 쓰윽 훑어보는데 로키에게 주려고 생각하면 마땅히 눈에 차는 물건이 없어서.. 생각이 아까의 꼬치구이에 미친다. 아, 그냥 사줄 걸 그랬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마을에서 먹고 갈까?"
로키의 쪽을 바라보며 다정히 물었다. 이제 마녀에게서 우울의 냄새는 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미안 답이 좀 늦었지? 날이 더워서 그런가 머리도 손도 느려지네.. ㅠㅠ.. 1:1 스레에 나도 욕심이 나는데 지금 컴이 고장나서 폰으로만 접속하거든... 8ㅅ8... (울먹) 세워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여태까지의 내용 복사 붙여서 새 스레에 옮기는 것두.. 으앙.. 부탁할 게 많아서 미안해지네.. ㅇ<-<
1:1스레 제목..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네.. 혹시 로키주는 생각해 둔 게 있어? 8ㅅ8 -
326 이름 없음◆WyDA1BitHA (5326093E+5) 2018. 7. 17. 오후 5:31:39>>325
답이 느린 건 괜찮아! 진짜 더운데 일부러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1스레 세운다! 신나!!(방방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지 말아!
스레 제목.. ㅋㅋㅋ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부한 거 말고 '영생을 사는 레몬금발 달콤체리 마녀님의 어쩌다 사람이 되어버린 커여운 댕댕이' 어때?ㅋㅋㅋㅋㅋㅋㅋ 나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아 너무 재밌고 웃곀ㅋㅋㅋ 더위 먹었나?? -
327 이름없음 ◆hmOfAjTEu. (9879493E+5) 2018. 7. 17. 오후 5:48:05>>326
그래도 미안해, 또, 너무 고마워! ㅠㅠ♥
흐흑.. 어제보다 더워.. 녹은 치즈가 되는 기분이야..(과열)(푸시시) 로키주는 괜찮니? 않잌ㅋㅋㅋ 난
[마녀와 마녀의 강아지] [마녀와 강아지][마녀님과 강아지군]←정말 센스없이 정직한 제목들이다.. ㅋㅋㅋ
[마법에 걸린 사랑]←이건 영화제목으로 기억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뎈ㅋㅋㅋㅋ 제목센스가 없어서 영화제목이나 팝송제목으로 할까해서 유투브 뒤지고 있었는뎈ㅋㅋㅋ 아닠ㅋㅋㅋㅋ 그 제목으로 하면 장르가 개그기믹 후추후추한 혼파망이 될 것 같잖ㅇㅏㅋㅋㅋㄲ 앜ㅋㅋㅋㅋ (웃다 호흡정지) -
328 이름 없음◆WyDA1BitHA (5326093E+5) 2018. 7. 17. 오후 5:54:51>>327
하트 반사 뿅뿅!!♥♥ ㅋㅋㅋㅋㅋ 나도.. 힘들어... 심지어 저녁에 나가봐야 해섴ㅋㅋㅋ 이 더운 날에 아휴ㅠㅠㅠㅠㅠ
ㅋㅋㅋㅋㅋ 아무래도 그렇겠지? 전에는 팝송이나 영화 제목, 꽃이름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ㅋㅋ [마녀와 강아지] 딱 좋은 것 같아.
담백하다고 해야할까? 어느 장르던 소화시킬 수 있는 제목!! 깔끔산뜻발랄하다!!(광고 아니라구여
여기서 계속 레스 잡아먹기도 조금 눈치보이고...() 어때? 마녀와 강아지로 할까? 다른 제목 생각나면 말해주구, 답레 보는대로 스레 세워올게! -
329 이름없음 ◆hmOfAjTEu. (9879493E+5) 2018. 7. 17. 오후 6:05:55>>328 흑흑ㅠㅠ 조심히 다녀와!
[마녀와 강아지]
로 하자! 좀 너무 정직하지만 이게 직관적이고 포괄적인 제목같아ㅋㅋㅋ 응, 사실 나도 레스 잡아먹는 거 조금 눈치 보였어 ㅠㅠ ㅋㅋㅋ 앞으로도 잘 부탁해 ;) -
330 이름 없음 (5602985E+4) 2018. 7. 18. 오후 3:53:591000마르소! 이 이상은 없습니까?
경매장 안은 잠시 고요함과 동시에 큰 혼란이 섞여흐른다
정작 그 장본인인 여인은 검은 드레스에 모자 레이스가 얼굴 전체를 덮어버려 얼굴도 표정도 알수없었고 다만 체형만이 자신이 여성임을 보여줄 뿐이였다
땅!땅! 그럼 상품은 127번의 손님께 낙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녀군
이번 상품은 저도 관심있었는데...
하! 불쌍한놈 차라리 내손에 들어오는게 더 편했을텐데
이형 경매의 큰손 미망인 레이스
돈의 출처도 정체도 얼굴도 알려지지않고 언제나 레이스로 얼굴을 가린채 괴물을 사모은다는것만 알려진 여인 그뒤의 괴물들은 어떻게 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것또한 모두의 궁금증중 하나이다
익숙한듯 그녀의 행동에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않고 그저 제 볼일을 끝냈다는듯 좌석에서 일어서 본인이 구입한 상품의 확인을 위해 시종들과 함께 무대뒤로 간다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기에 어수선한 무대 뒷편 여인은 그리 참을성이 크지 않은지 주변의 시종이 말리는데도 억지로 상품이 가려진 철창안을 스스로 열어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너머로 흥분된 뜨거운 숨이 느껴진다
::늑대인간.흡혈귀.요정등 특이한 존재를 모으는게 취미인 돈많은 미망인과 특이한 존재로 돌려볼사람? 둘의 관계는 이야기에따라서 다르겠지만 고어틱한 주종관계에서 달달한 연애까지 뭐가되도 좋을것같아 관심있으면 이어줘! -
331 이름 없음 (4397227E+5) 2018. 7. 18. 오후 9:54:45>>330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린 건지.
가림막으로 덮여 바닥에서 반사되는 미약한 빛 뿐만이 내부를 밝히는 철창 안에서, 너는 네가 팔려갈 가격만을 들을 수 있었다.
웃기지도 않는다.
머릿수 외에는 어떤 종족보다도 나은 게 없으면서, 인간들은 이종족을 포획하고 사냥했다던가.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 이종족들은 자유로운 편인 모양이었지만.
너는 아니었다.
너는 어떠한 이종족에도 속하지 않았다, 부모도 없었다.
그런 너와 같은 존재는 이전에도 있었고, 마족들은 일종의 신으로 받들었던 모양이지만 경솔하게 인간을 적대한 마족은 말 그대로 쓸려나갔고.
네가 태어났을 때 너를 받들 마족따윈 없었다.
뒤통수부터 돋아나 이마까지 다다른 굵은 뿔과, 감정에 혼선이 오면 곧잘 역안으로 변해버리는 눈, 반투명한 검정색의, 네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는 날개.
그리고 머리가 날아가고 심장이 꿰뚫려도 살아나는 생명력까지.
그야말로 흥미로운 상품일 수밖에.
어느 새 가격을 부르는 소리가 잦아들고, 인기척과 함께 가림막이 걷힌다.
" ...... "
그림자 속에서 네 붉은 눈이 빛을 냈다.
양 손과 발은 족쇄에 구속되어있었고, 목에도 자물쇠가 잠겨있었다.
한 두번은 쉽게 박살냈지만 그 뒤부턴 마나를 순환시키기만 해도 손발목이 으깨졌다.
고통은 익숙해지지를 않는다.
오직 너를 상품으로 여기고, 경매에서 승리했다는 감각에 취해 너를 보러 왔으리라.
너는 이를 빠득 갈았지만 그뿐이었다.
잘못했다간 목이 으깨질 테다.
//살포시.. -
332 이름 없음 (2310547E+5) 2018. 7. 19. 오전 12:11:19"저택에서 다시 보도록해요 자기"
아쉬운 눈을 하며 그녀는 각자의 마차에 올라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저택에 돌아왔을때의 그녀가 제일 먼저 한일은 여행의 피로도 잊은채로 당장 콜렉션룸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자, 새 자기를 맞이하러 가도록하죠"
저택의 지하계단 벽면에는 확실히 인간이라 생각되지 않는 것들의 가죽들이 자랑스레 진열되어 있고 그곳을 통과하고도 길고 어두운 복도에서 짐승도 사람도 아닌 온갖언어를 토하듯한소리가 들려온다
그 깊은 복도 끝에는 오늘만을 위해 비워둔 화려한 고딕양식의 방이 있었고 그곳엔 온갖 값이 되보이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과 천장에는 사치스러운 크리스탈이 장식된 조명들로 꾸며져 이곳이 지하인것을 금세 잊게 만들어주고 바닥에는 붉고 검은 융단과 푹신해보이는 벨벳쿠션들이 쇼파에 채워져 있었다
손님방보다도 호화스러워 보이는 이곳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도 그 방의 주인은 온몸이 쇠사슬이 채워지고 눈은 천으로 가려진채 꾀죄죄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던져져있었다
그녀는 시종들과 방안으로 들어가 미처 벗지못한 외출복을 벗어던졌다
레이스를 치우자 드러나는 물빛 머리카락 색소가 옅어 쾌청한 하늘빛같아 보이기도 하며 실크처럼 그녀의 어께를 흘러내렸고 또한 눈빛은 초저녁의 밤하늘과 닮은 남색에 별빛이 부서지는한 착각이 일어나는듯 청조하고 맑은 색이라 도저히 이 장소 행동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장갑을 벗고 그녀의 얇고 흰 손가락이 뿔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꽃잎처럼 섬세하게 훝고 지나간다.
"강인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그말은 진심인듯 눈에서 꿀이 흘러넘치는듯 하다
"먹어버리고 싶어"
순식간에 그녀는 그것의 귓볼을 물어뜯었다
턱힘이 그리 크지 않아 뜯겨지지 않았지만 붉은 선혈이 실처럼 그녀의 침과 섞여 늘어졌다
/변태아줌마라 죄송합니다 쓰면서도 마신?괴물?한테 미안했어ㅠㅠㅠㅠ역시 고어는 좀 싫으려나 너 참치 취향좀 물어봐도 될까? -
333 이름 없음 (0804475E+5) 2018. 7. 19. 오전 12:32:35>>332
나중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여자는 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제 조금은 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곧바로 철창을 마차에 싣는 모양이었다, 덜컹거리는 마차의 짐칸 안에서, 너는 눈을 감은 채 최대한 쉬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도착은 빨랐고, 너는 눈이 가려진 채 부드러운 천을 밟았다.
누군가의 인도로 쭈욱 걸어가다 보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조금 걷다가 멈춘다.
인기척이 사라진다, 방 안인 것인가.
눈가리개를 벗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 피곤했다, 너는 사슬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매장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려온다.
-먹어버리고 싶어.
뭐?
다음 순간 귀에서 격통이 느껴졌다.
" 크아아아악...이런 썩을...! "
사슬이 묶였지만 네 힘은 그 이상이다, 너는 손을 들어 귀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 젠장, 식량으로 쓰기 위해 날 사들였느냐?! "
축축하게 피가 손을 적신다.
//괜찮괜찮 해! 애증이 최고긴 하지만 뭘 해도 괜찮아! -
334 이름 없음 (2310547E+5) 2018. 7. 19. 오전 12:52:53"식량? 아하하하하하"
그녀의 미소는 갓 일어난 햇님처럼 구김없이 밝았고 그것은 입가에 묻은 핏자국과 대조되 보였다
손가락으로 입주위의 피까지 깔끔히 햝은 뒤 다시 그의 옆으로 간다
"죄송해요 아프셨나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금세 나은 귓볼을 신기하다는듯 바라보며 그곳에서 눈을 못떼는 그녀는 다시 그의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한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사랑하죠 평생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나의 전 남편들은 약해서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날 떠나지 말아줘"
남색 눈은 광기가 차오르고 진득하게 껴앉아지는게 분명 방의 온도 습도는 보통임에도 감촉이 나쁘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미망인은 얼굴이 예쁘지만 연애운이 매우 나쁜 여자로 3번의 결혼을 통해 남편들은 전부 일찍죽고 남은건 축척된 거대한 재산뿐이라 약한 인간을 제외한 괴물들에게 강함을 증명시키며 영원할 사랑을 찾고있다는 이야기 -
335 이름 없음 (0804475E+5) 2018. 7. 19. 오전 1:04:17>>334
" 보통 귓볼을 물어뜯으면 고통스럽다! "
기본적인 걸 묻는 것만 같아 너는 짜증을 냈다, 어차피 쉽게 죽지도 못하는 몸이지만 고통은 끔찍하다.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손에 묻은 피는 그대로, 너는 그녀가 다가와 너를 만지고, 껴안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밀쳐낼까 생각했고, 너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 달라붙지 마라, 내가 대체 왜 좋다는 것이지? 대체 날 언제 봤다고. "
남편들? 전부 죽었다는 것인가?
너는 절로 오싹해지는 느낌에 고갤 저으며 말했다.
" 어차피 이 곳을 떠나봤자 금세 잡히고 말겠지, 원하는 게 무어냐? " -
336 이름 없음 (2310547E+5) 2018. 7. 19. 오후 1:41:33>>335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고통스러운 표정 참을수 없게 사랑스러울것같아 그만"
그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정돈하며 만족한 얼굴로 그의 가슴께에서 올려다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처음본 그순간부터 사랑하게됬어요"
그의 뺨에 깃털처럼 가볍게 키스한다
"저는 원하는게 그리 많지 않아요 다만 당신과 평생을 사랑하며 사는것..그것뿐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일께요"
"자기는 뭔가 원하는것이 있나요? 땅 깊은 곳은 보석도 저 바다 너머의 신비로운 물건도 모두 가져와드릴수 있어요 말만 해주세요 나의 사랑" -
337 이름 없음 (7484271E+5) 2018. 7. 19. 오후 5:54:09>>336
" ...... "
그의 머리카락은 당연히 정돈되어 있지 않은 채 꽤 길게 늘어트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머리카락을 정돈하자,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대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 거지?
뺨에 닿는 입술의 감촉에 그는 눈을 깜빡였다.
" 그만둬, 평생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지만,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느냐. "
신으로 받들어지기까지 했던 종족이라지만 지금은 나락에 떨어졌다.
나 말고 다른 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인간에게 붙잡혀서 노리개로 팔려온 신세다, 누굴 사랑하거나 해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 ...일단 이 사슬 좀 풀어도 되겠지? " -
338 이름 없음 (2310547E+5) 2018. 7. 19. 오후 11:45:49>>337"당신은 이제 절 사랑해야되요 아니 그럴수밖에 없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고 있으니까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게 차라리 이 지하의 쥐에게 이야기하는게 덜 답답할것만같다
"사슬이 불편한가요?"
그의 사슬을 무겁게 들어올린다
"하지만 푼다면 저에게서 도망치실지도 모르고 아! 사지를 모두 자른뒤 목에만 사슬을 채운다면 풀어드릴수 있을텐데 당신이라면 분명 강아지같아서 귀여울것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쁜지 입가에 호선이 그어진다
진심인듯한 모습
"하지만 곧 재생할테니까 아쉽네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않을건 아니지만 잠시만 기다려요 자기"
"톱과 망치를 가져오렴!"
이내 여자의 시종들은 그녀의 앞에서 그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부순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피를 그녀는 정면에서 맞으며 새로운 모습이될 그의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본다
"괜찮아요 자기 내가 옆에 있어요 잘 참는다면 잠깐정도는 산책하러 갈수있을지 몰라요"
/다른소리지만 이게 사실 드라마였고 촬영끝나고 둘이 어색하게 수고했습니다 같은소리 했으면 재밌겠다
할짓못할짓 다해놓고 어색해하는 둘ㅋㅋㅋㅋㅋㅋㅋㅋ -
339 이름 없음 (5200999E+5) 2018. 7. 20. 오전 12:37:48>>338
" ...... "
단단히 미쳤군.
말도 통하질 않는다, 처음부터 일방통행이었어, 대화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헛소리였다고.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말을 주고받는다고 대화가 아닌 게 분명할텐데.
" 젠장, 재수 옴 붙었군. "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한 상황이다, 풀어주리라 잠시 기대한 내가 멍청이였다.
물론 풀어주기는 할 모양이었으나...
" 그만둬, 제기랄, 귓불 뜯긴 걸로 충분해!!! "
팔다리가 톱에 잘려나가고 망치에 으깨지는 소리가 비명에 섞여 들린다.
비명소리는 어느새 신음으로 바뀌었고, 숨을 가쁘게 토해내는 그는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다.
" ...... "
마음만 먹으면 눈 앞의 여성 정도는 손쉽게 죽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뒷일이 문제였다, 죽을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죽을 수가 없었으니까 문제였다.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근본적으로 그를 노리는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는 한 평생을 쫓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 ...저리 꺼져. 날 내버려 둬라. "
어느새 돋아나기 시작한 팔다리를 보며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으르렁댔다.
//엌ㅋㅋㅋㅋㅋㅋㅋ그런...!!! -
340 이름 없음 (1517472E+5) 2018. 7. 20. 오전 2:25:27>>339그의 눈앞에서 피를 잔뜩 취한 여자가 환상에 젖은 눈으로 그를 쓰다듬는다 더이상 외부의 소리는 차단되었는지 신음하는 그것에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볼뿐이였다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모든것이 다끝났을 무렵 그녀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아쉽다는듯 입맛을 다셨다
"너무 빨리 나아버리네요 그런점이 우리 자기의 장점이지만"
그의 남겨진 팔다리에 다시 키스를 하며 귀여워한다
"까칠해라 내버려둘수있을리가 그도 그럴것이 우리는 부부잖아요"
피에 젖어 살아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고깃덩이인지 불분명한것에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며 방을 나선다
"피곤할텐데 혹시 제가 계속 휴식을 방해한건가요? 내일 다시 오도록 할께요 자기 다음엔 좀더 즐겁게 놀도록 해요"
다음날의 오후 그것은 거의 방치하다싶이 피투성이의 모습은 여전했고 다만 팔다리가 원래처럼 다시 자라있었다
"자기- 제가 없어 슬프셨나요? 오늘은 같이 점심을 먹도록해요"
지하와 어울리지 않는 피크닉상자에는 알수없는 형식의 병들이 들어있었다 하나같이 해골표시가 그려진 것이 말없이 자신을 소개하고있었다
"자 아 하세요"
처음부터 냄새가 고약한 스프를 그에게가져다 댄다 역겨운 하수구같은 악취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곰팡이를 닮은 진녹색의 점액은 있던 식욕도 달아나게 하기 좋아보였다
"몸에 좋은것은 조금 쓸지도 몰라요" -
341 이름 없음 (0814091E+6) 2018. 7. 20. 오전 4:30:21찰랑, 유리잔 가득 채워진 마르가리타에 어스름한 조명이 투과되어 초록빛으로 일렁였다. 해가 완연히 저물어 창틈으로 달빛이 은근하게 밀려들었고, 거리 위에 융단처럼 깔린 그림자가 서서히 길게 늘어졌다. 한창 때의 청년들이 홰를 치고 다니기에 딱 좋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한산했다. 가끔 검은 정장모를 깊게 눌러 쓴 이가 빠른 걸음으로 창밖을 지나갈 뿐이었다. 창문에서 시선을 거둔 그녀는 이내 가게 안을 흘끔 둘러보았다. 작은 바 안에 있는 건 그녀와 구석에서 포커를 치는 두셋 정도의 무리-간간히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그리고 수건으로 잔을 닦는 중인 젊은 바텐더 밖에 없는 듯했다. 그녀는 잔을 자신의 두 눈 앞에 가져가 대고서 술의 빛깔을 보는 척하며 그 너머로 바텐더의 모습을 몰래 살폈다. 과연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기는 한가? 그런 것 치고 바 안에 손님도 몇 없는 데다, 무엇보다 저 젊은 주조사는 너무 앳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뒷골목이야 워낙에 여러 만상의 인간들이 포진해있는 곳이라지만, 그 누가 저의 얼굴을 보고서 대뜸 신흥 범죄조직의 주요 인사를 연상할까.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뱉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허탕을 친 것 같습니다'를 열 페이지 남짓의 경위서로 늘릴 것이 벌써 걱정되었던 까닭이었다. 이래서야 형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문예 작가나 해야겠는데.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고 뜸들이듯 잔을 빙그르르 돌려대던 그녀가 이윽고 입술을 열고 짤막하게 말했다.
"라임 주스가 너무 적어."
//최근 도시에서 일어나는 연쇄 강력범죄와 연관된 조직을 쫓는 형사와 뒷골목의 바텐더...! 같은 느낌으로 썼어! 완전히 무관한 술집 주인이어도 괜찮구 브로커라거나 여러 조직과 연결된 인물인 것도 좋고, 아니면 형사가 추적한 대로 조직의 간부인 것도 좋아 ^-^!! 일부러 바텐더의 성별도 특정하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이어줘! -
342 이름 없음 (4852629E+5) 2018. 7. 20. 오전 10:16:18>>340
" ...... "
어이가 없군.
제대로 정신을 붙잡고 있는게 신기할 수준이었다, 이정도로 학대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갤 숙인 채 여성이 키스를 하든 말든 내버려두었다, 어차피 팔 다리도 다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며 여성이 들어오자 너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또 뭐야.
" 이봐, 차라리 굶기지 그래. "
지금은 죽어도 먹기 싫으니까 말이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 ...... "
방법을 생각해둬야 해, 시종들 정도는 맨손으로도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일이 커지지 않도록 최소한만 죽일까, 저 앞의 여자는?
...... -
343 이름 없음 (5170524E+4) 2018. 7. 21. 오전 12:35:34>>342몸에 좋다는건 다넣어 만든 특수요리가 다시하번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은수저위에 얹어졌다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다행히 독은 안들어있는지 은수저는 본래의 광택을 잃지 않았다
"아내로써 남편을 어떻게 굶길수 있겠나요 공복은 몸에 안좋아요"
굳게 닫힌 입사이로 죽을 밀어넣어 보지만 그의 완고해보이는 말에 손가락으로 그의 말랑거리는 입술을 만지작대며 장난스레 말한다
"자 투정하는 나쁜 이빨은 전부 뽑아버릴꺼예요"
이빨을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게 귀여우면서도 소름돋는다
둘의 낮부끄러운행태에 시종들은 질릴만하지만 오히려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품안에서 구형태의 마도구를 꺼내 준비한다 한사람한사람 보통의 시종은 아닌듯하다 -
344 이름 없음 (4000406E+5) 2018. 7. 21. 오전 11:06:53>>342
" 네가 죽을때까지 뽑아내도 다시 다랄 텐데 말이지. "
헛수고.
그는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은수저에 얹힌 건강(?)식을 한 입 먹었다.
맛이.
" .....대체 뭘 어떻게 넣은거야. "
그는 절로 찌푸려지는 얼굴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 어제 내 팔다리를 자른 건 눈감을테니, 뭘 하려면 제대로 이야기해준 뒤에 해줬으면 하는데. "
제발 무턱대고 달려든다거나 그러지 말라고.
" 사랑받고 싶다면 그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어? "
그리고 그는 시종 쪽을 흘겨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
345 이름 없음 (5170524E+4) 2018. 7. 21. 오후 11:26:59>>344"그럼 식사때마다 뽑아드리죠 아내의 의무로써"
매우 흥분된 표정 이쯤되면 그냥 괴롭히는것을 좋아하는것 같아보인다
그 증거로 그가 음식에 입을대고 얼굴을 찡그리자 잔뜩 흥분한 얼굴로 한스푼 더 가져다댄다
"어인의 해초 용의 발톱 인어의 눈물 오우거의 위액 이국의 왕의 불로장생 비약이였다는 소문을 듣고 힘들게 구했답니다 우리 자기에게는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같이 구하기 힘들고 호화스러운 재료들 대부분은 마법약에 쓰이지 그저 식재료로 쓰이는것이 아까울정도다 그 주문의 받던 요리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예상이갈정도로
계속 음식을 먹여주던 그녀가 그의 말에 매우 놀란 얼굴로 급히 대답한다 얼마나 놀랬으면 쥐고있던 숟가락까지 떨어뜨린다
"사랑!네 물론이죠 대신 꼭 사랑해주셔야 해요 혹시 키스하는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
346 이름 없음 (8503681E+5) 2018. 7. 22. 오전 12:42:45>>345
" 그건 봐줬으면 하는데. "
그는 그녀의 반응에 지쳤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울렁임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음식(?)을 어쨌든 받아먹으면서 한숨을 내쉰다.
" 보통 그건 음식으로 만들지 않잖아, 말 그대로 약재라고. "
약재는 약을 만들라고 있는 거지 음식을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그녀가 네 말에 상당히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자 이게 스위치인가, 하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 그건... 천천히 정하도록 하지, 기본적으로는 내게 뭘 하려면 미리 말해줬으면 하는데. "
하지말라고 해서 안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대비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것 아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 사랑받고 싶다면 누군갈 대하는 태도부터 조금 고쳐야겠지. " -
347 이름 없음 (6602514E+4) 2018. 7. 22. 오전 11:32:59“조, 좋아한다!”
건장한 키, 다부진 체격, 짧게 친 황금빛 머리카락. 왕의 위엄과 호기로움이 느껴지는 얼굴이 붉게 물든 것을 숨기려는 듯이 고개를 폭 숙이고 있다. 당신에게 내민 큼직한 양 손에는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금은보화가 아닌, 스쳐지나가듯 알려주었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을 모은 꽃다발이 들려있다. 실제로 많은 준비를 했고, 자신의 고백이 한번도 통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지금은 달랐다.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연인들은 모두 얕은 호기심으로 고백들을 전부 받아들여 짧게짧게 사귀어온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거절하면 어쩌지, 싶은 걱정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설마 자신이 누군가에게 반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의 인생에 있어 첫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해 굉장히 소소했지만, 당신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으므로 이를 택했을 뿐이다.
“부디, 받아주게……앗, 아니, 부담된다면 무리해서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짐은, 그저 옆에 있고싶을 뿐이고, 좀 기분나쁠지도 모르곘지만 일단은 진심이고…분명 나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들었을테지만, 나는 그 뭐냐, 내가 직접 고백하는 건 처음이라서….”
횡설수설, 말은 헛나오고 혀는 꼬이기 시작했다. 절제 없이 한마디 한마디 튀어나올 때마다 혀를 꺠물고싶어지는 심정이 되었다.
#산군이 고백해왔다!(두둥) 소동물 혹은 같은 육식계 동물이라도 괜찮아! HL 난입자유! -
348 이름 없음 (9244608E+5) 2018. 7. 22. 오후 2:37:27>>347
이 산의 지배자인 산군께서 친히 저를 불렀을 때에는 겁에 질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더랬다. 혹시 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마 산군께 누를 끼친 짓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산군님의 손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인지. 암컷을 희롱한다든지,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쫓아낸다는지 하는 친구 토끼들과 다른 수인들이 수군거리는 산군님에 대한 소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쫓겨나는 걸까? 아니면 죽게 되는 걸까?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흔들리는 다리를 이끌며 산군님의 뒤를 따랐다. 최소한은 추방, 잘못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산길을 따라 부모님과 남매들이 얼굴이 사라졌다.
산군님이 발길이 멈춘 곳은 달빛이 잘 내리쬐이는 숲속이였다. 저가 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고, 산군님을 처음 뵌 곳이었다. 바보같이 그때에는 산군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수인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감히 좋아하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대화를 나누는 객기를 부리며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됬는데, 동경하게 된 수인이 알고보니 산군님이였을 줄이야.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며 눈을 질끈 감는다. 입술을 깨문 것은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나와 제 목숨을 취할 산군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숲 속의 공기를 들이 마셨는데.
비강을 간질이는 꽃향기는 분명 저가 좋아하는 꽃이었다. 흙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있을 때에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고 흰 꽃망울이었건만, 꽃송이 하나하나가 찌부러지지도 않고 커다란 손아귀 사이를 가득 채운 것으로 보아 정성스레 만들어진 꽃다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꽃다발은 실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 정신이 쏙 빠졌다. 아니, 꽃다발만이 아니라 산군님께서 하시는 말들이 혼을 앗아가 단단하게 감긴 붉은 눈이 어느새 휘둥그레 뜨여졌음을 알지 못했다.
"네? 그게 무슨...저, 저, 저 안 죽이시는 거에요? 안 희롱, 아니, 그게...그러니까, 안 쫓아내시..."
저가 말하는 말들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전부 산군님의 심기에 거슬리는 내용일 것이라 화들짝 놀라서 말을 고쳤지만 이미 내버린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다. 요망한 혓바닥이 입안에서 제멋대로 뛰어놀아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여 얼굴을 숨겼다. 지금 있는 힘껏 뛴다면 산군님도 못 잡으실지 모른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눈을 굴려 퇴로를 찾았지만 산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엄이 발을 옮아매고, 훌륭해보이는 꽃다발이 저 커다란 손에서 소중하게 쥐어져 있는 것과 저의 붉은 얼굴과는 성질이 다른것 같지만 홧홧하게 열이 올라있는 저의 얼굴도 저런 얼굴이 아닐까 하는 산군님의 붉은 얼굴을 두고 도망칠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잘 받을게요..."
꽃다발을 두손으로 조심스럽게 받고 가슴에 꼭 껴안고 나니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저의 당황스러움이 왜 이러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이유도 모른채 어물어물 흰 꽃망울 무리와 저의 은빛 머리칼 사이로 붉어질대로 붉어진 얼굴을 묻어버렸다. 생각해보니 산군님의 말에 대한 대답도 어정쩡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얼굴을 꽃다발 속에 더 깊이 파묻자 긴 은발이 꽃다발 위에 내려앉았다. 은은한 꽃향기가 마음 속까지 들어차는 것 같았다. -
349 이름 없음 (6602514E+4) 2018. 7. 22. 오후 4:27:08>>348
“주, 죽여…? 희롱? 쪼, 쫓아낸다니…….”
대체 자신의 이미지는 어찌 되먹은 것일까. 물론 산군의 자리 위에 군림하고 난 뒤에는 꽤나 방탕하게 놀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 먹고싶은 것을 먹고, 하고싶은 것을 한다. 연애도 즐겨했으나 괜히 묶이는 것은 싫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깊은 관계는 꺼려했다.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까지의 삶은 그저 폭군이 아닌가 싶지만 산군으로써의 할 일은 전부 빠짐없이 행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어영부영 넘겨왔다. 그렇지만 상대가 싫다는 것을 강제로 행한 적은 없었다. 단 한 번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간 것일까. 자신이 내민 꽃다발을 겁에 질린 것이 분명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을 눈에 담으니 독을 바른 손톱으로 심장을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왔다. 차라리 산군임을 밝히지 않았으면 저런 표정은 짓지 않았을까. 산의 모든 생명 깃든 것들을 호령하고 외부의 침입을 용서치 않으며 그 날카로운 발톱 하나로 구름을 가른다는 산군은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지 않게 조마조마한 얼굴로 길고 윤택 있는 호랑이 꼬리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도망칠 것 같은 당신의 표정에 꼬리가 흔들리는 속도가 점점 빨리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당신이 꽃다발을 받아줄 때에야 꼬리가 우뚝 멈춰섰다. 머리카락만큼이나 황금빛으로 일렁이던 눈동자 역시 우스워 보일 정도로 커다랗게 동그래져, 산군의 몸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직 정돈하지 못한 숨 탓에 들썩이는 어깨 뿐이었다.
“……그, 렇다는 것은…….”
산채만한 몸집의 사내가 잔뜩이나 몸을 움츠리고 서서, 사랑에 빠진 소녀와 같은 눈빛으로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분명 제 3자가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괴롭힘의 장면이리라. 하지만 산군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흰 꽃망울 역시 달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당신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곱게 기른 가느다란 상아빛 머리카락에 그 어떤 보석도 담지못할 수려한 빛을 품은 붉은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계속해서 눈에 담고싶을 정도로 산군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짠 꽃다발에 저렇게 얼굴을 묻고있으니, 자신 역시 땅을 파 거기에 얼굴을 묻고싶을 심정이었다. 그래, 자신이 생각해도 이 고백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당황스러운 것도 당연하겠지. 산군은 어슴푸레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었다. 당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것도. 그런 이성과는 다르게 감성은 한결같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천천히 가라앉혔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거라. 산군이나 종 같은 것을 떠나서,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써 고백한 것이니까. 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심히 염려되지만 짐과 관련된 소문들은 전부 헛소문일세. …아, 아니, 반정도…마, 만약 그 점에 실망해서 짐을 떠나가더라도 붙잡지않겠네! ……가끔 같이 꽃을 보는 친구로, 아니, 이것 역시 부담스러울까…하, 하지만.”
처음엔 위엄있는 산군의 목소리를 잘 뽑아내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할 정도니까. 그러나 가면 갈 수록 구차한 어조가 섞이더니, 결국엔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한 어리숙한 청년이 되어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독버섯을 먹은 것 마냥 꼬리 역시 지멋대로 바닥을 향했다 하늘을 향했다, 정신 사납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건……외로울 것 같아서.”
자신을 산군이 아닌 한 명의 수인으로 대해준 이. 자신이 좋아하는 꽃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예쁘게 웃어주던 이. 몸집이 큰 자신을 배려해주던 이. 떠나간 꽃다발이 남긴 향이 피어오르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꽃은, 가시가 조금 있으니 주의하더랬지. 서투른 나머지 손에도 생채기가 잔뜩 나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바보같군. 산군은 작게 웃었다. -
350 이름 없음 (9244608E+5) 2018. 7. 22. 오후 6:32:51>>349
꽃향기에 섞인 갓 뜯어낸 풀의 향기가 싱그러웠다. 향기로 시각을 차단하자 가득이나 예민한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서 산군님에게서 묻어나오는 권위가 전해져 저의 앞에 있는 수인이 단순한 수인이 아닌 산군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느끼게 했다. 자연히 산군님의 달래는 목소리에도 몸이 움츠러들어 꽃다발 속에 묻은 얼굴이 이제는 꽃다발을 뚫고 나올 정도가 될 정도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낯간지러운 감정을 거침없이 내보인 그가 멀고도 가까웠다.
둘이서 꽃을 봤던 그 날, 산군님이 아닌 한 사람과의 만남을 기억한다. 저의 앞에 있는 산군님은 소문에 조금이지만 긍정을 말했으나, 그날 한 수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은 것 같은 산군님과 겹쳐져 하나가 되어 들려와 소문은 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단 한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 매일 밤 몰래 나가 숲속을 기웃거렸던, 동경하던 사람이 저의 앞에 있었다. 산군님의 꼬리가 허공을 가르며 붕붕거리는 소리가 그리운 목소리의 저편에서 맹렬하게 들리자 저의 귀 또한 미친듯이 쫑긋거리기 시작하는게 느껴져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다른 산토끼들과 달리 눈에 띄는 생김새로 친구들과 잘 섞여들 수 없어 고민했다. 흙과 나무의 색에 어우러지지 못해 눈에 쉽게 발견되고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쉽게 발각되어 둘 다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많았다. 자연스레 혼자 몸이 되는 일이 많았다. 저도 토끼인데 신기한 것을 보는 토끼들의 눈이 싫었다.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웠다. 스스로 몸을 가두다 답답함을 못 이기고 나갔던, 꽃이 많이 피어있던 밤의 숲에서 확연히 큰 몸과 금빛으로 빛나는 눈을 한 수인이 눈에 밟혔다. 홀로 있음에도 그는 강해보였고, 이야기를 나누다 초면임에도 고민을 털어놓은 부담스러운 저에게 시원스레 웃으며 '특별' 이라는 단어를 가르친 이가 그 날 이후에도 매일같이 생각나 홀린듯 밖으로 나갔으나 기약없는 만남은 익숙해져버린 외로움을 새로이 불어넣었는데. 얼굴이 있을 희고 푸른색들 속에서 미미하게 흔들리는 붉은색이 올라왔다.
"저, 저도, 저는 외로웠어요...!"
바닥을 치는 자신감이 저는 외로웠는데, 산군님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제 마음에 확신을 담아 커지려는 소리를 잡아 누른다. 산군님이 호의를 보여주셨는데 이제서야 얼굴을 내밀었으니 벌이라면 벌일까 뺨을 문지르는 가시 박힌 꽃대와 뾰족한 잎이 까칠하게 저를 긁어내릴 것이었다. 마침 풀냄새가 강하니 튼튼하고 가시가 오밀조밀하게 들어차 있는 꽃일 것이리라 했는데 웬걸, 줄기에 달려있을 가시가 뜯어진 자국을 남긴채 사라져 있었다. 풀냄새가 강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구나. 얼굴을 들어 나타난 얼빠진 시선이 산군님의 손바닥으로 향했다. 미세하게 흙가루가 들어간 손톱, 초록빛이 물들어 있는 손가락, 얼핏 보면 말끔해보이지만 붉은기를 내보이며 손 전체에 그어져 있는 실선들을 보자 절로 움직이는 발걸음이 뜀을 뛰는거나 마찬가지였다.
"바보! 다쳤잖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꺾으려면 잘 꺾어야 한다고 그랬는데...저 같은 것 때문에...괜히 이런..."
산군님을 향해 건방지다 할 수 있을 말을 내뱉었으나 말을 고른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함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몸과, 미미하게 흔들리고 있던 눈동자가 물기에 젖어 더욱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 대신 표현하고 있었다. 공중에 떠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움직이던 손이 커다란 손을 마주잡고 작게 내밀어진 혀가 손바닥에 미끄러지려 했다. -
351 이름 없음 (6602514E+4) 2018. 7. 22. 오후 7:52:09>>350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그저 그런 짧은 밤산책일 뿐이었다. 짙은 향이 달빛을 따라 흘러퍼지는 곳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자신 아래에 있는 꽃에 대해 흥미조차도 없었다. 달빛 역시 항상 쬐던 그 달빛이었다. 그래,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산의 생물들보다도 빠르게 달리고 높이 뛰는 자신이다. 그러나 그 날은 자신이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뛰었으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마치 ‘혼자’인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먼저 말을 건 자신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혼자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몇번 이야기를 나누니 아이처럼 기뻐하던 너. 그 고민은 너무나도 자신과 자신의 위치와는 동떨어져있는 고민이었다. 그러니 저가 어떤 말을 해주든, 그것은 너에게 있어 와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해주었다. 너는 특별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 얼마나 귀엽던지. 몇번이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웃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아무것도 아니던 달빛과 꽃들이 가슴 한 켠에 사무치게 된 순간이었다.
“정말인가? 내가 네 외로움을 잠깐이라도 달래주었다고 생각하니, 기쁘구나. 다행이야.”
당신의 작은 외침을 들은 산군은 방긋 웃었다.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모습에 부담을 지우고싶지 않아 일부러 호들갑을 지웠다. 나도 외로웠어! 그보다 훨씬훨씬 더 외로웠다네! 마음 속 외침은 마음 속으로만, 이미 산군의 위엄어린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많이 늦은 것 같으나 그보다도 더 네 미소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 때, 네가 웃어주던 그 날의 편한 말투를 일부러 흉내냈다. 짐이라는 호칭도 일부러 떼어냈다. 모든 행동과 사고가 네 미소를 보고싶다는 일념 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웃어주지 않는구나.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달갑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 산군 앞에서 ‘싫다’라는 말을 쉽게 낼 수 있겠는가. 애매모호한 답변만 주는 것도 전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니 온 몸에 오한이 훝고지나갔다.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 그 미소, 그 웃음소리, 그 눈동자. ……적당히 좋아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자신의 첫사랑은 떠나가는건가 싶어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던 그때, 드물게도 당신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얼굴로 그대를 바라보는 산군은 걱정어린 질책에 제대로 입을 열지도 못했다.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건 수십년전에 그만두었다. 그런데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참기 위해 입술을 꼬옥 깨물 정도였으니까. 그렇지만 곧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물기어린 눈동자와 떨리는 몸을 보고선 제대로 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했다. 짧은 사과의 말을 전하려던 산군은 자신이 손을 잡혔는지도 몰랐다. 자기의 손과 비교해선 아기 손이나 다름없는 것이 잡아온 것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산군의 손바닥을 핥을 때 즈음, 산군은 마치 석상이 된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뇌정지가 온 산군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지 못하고 당신을 내려다본다.
“좋아해.”
상황에 전혀 맞지않는 진심어린 말을 내뱉은 산군은 때늦은 후회를 했다. 눈동자는 핑핑 돌고있었다.
“아, 아니! 거, 걱정을 끼칠 생각은 없었는데. 그, 태생부터 손이 커서 가시를 골라내기 어렵더구나. 하지만, 네가 꽃을 보면 웃어주었으니…너를 위해서라면 작은 생채기일 뿐이지!”
그렇게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만 같았다. 벌벌 떨리는 팔을 다른 손으로 붙잡아 떨림을 가라앉힌다. 이러다 얼굴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 그러나 자그만한 온기와 보드라운 감촉이 전해져와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모르겠는 것이다. 그러나 듣고싶은 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끌면 자제심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 차일거면 빠르게 차이고 몇주 동안 동굴에 틀어박혀있으면 된다. 산군은 상처를 쉽게 훌훌 털어버리는 남자는 아니었다.
“……이제 말해주지 않겠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대 산군이라는 걸 의식하지 말아주었으면 해. 이 고백을 거절한다고 해도 네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산과 산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우린 지금 이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니 걱정말게나.”
산군은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고, 당신과 눈높이를 맞추어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꾹 일자로 다문 입, 힘이 들어간 눈동자. 산군은 자신의 손을 붙잡은 당신의 조그만 손 위에 다른 손을 살포시 포개었다.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울지말자. 그것만은. -
352 이름 없음 (9244608E+5) 2018. 7. 22. 오후 10:02:10>>351
씁쓸한 흙과 풀의 맛 사이에서 꽃향기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혀로 느낀 산군님의 손바닥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에 난 생채기를 소독하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저의 정신을 일깨웠다. 상처 소독은 반만 진실이었다. 토끼의 본능은 저가 토끼인 이상 핥는 행위가 어떤 감정을 품고 하는 행위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는가. 사랑이라니, 저 주제에 감히 누구를.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저가 산군님께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산군님이 아니라도 핥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수인을 두고 지금 저가 한 짓이 희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지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변하다 못해 눈동자와 혼연일체가 되었고, 붉은 얼굴과 눈동자의 색은 목덜미와 이어져 원래 희었던 온 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흰 부분이라고는 머리카락 밖에 없었다. 정신이 깨자마자 조금씩 하늘을 향해 아득하게 멀어져가고 있는 중에 저를 땅속 끝까지 푹 꺼트린 건 깜짝 놀랄 정도로 똑바르게 들어온 저를 향한 애정의 단어였다. 산군님의 무언가 말하는 입모양을 쫓았으나 방금까지도 예민한 청력을 자랑하는 귀는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 산군님의 상처에 놀라 땅에 떨어트려 버린 꽃다발과 산군님의 상처맺힌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말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저가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온전하지 못한 정신 덕분인지 지금까지 산군님의 모습을 제대로 눈에 담을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어느 순간에 산군님의 반짝거리는 금빛 눈동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늠름한 이목구비에서 전해져오는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가고, 가슴 속의 뜨거운 것이 올라와 머리를 덮었다. 저는 그에게 있어 '특별' 할 지도 몰라.
정신이 땅 속으로 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신이 아니라 저의 손 아래와 위 양쪽을 덮은 듬직한 손이 부드럽게 덮자 온몸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다. 저의 눈은 그를 놓지 못하고 저의 손은 아직도 그를 잡고 있었구나. 저는 그와 지금 눈을 마주하고 있구나. 맞닿았던 시선을 다시금 꽃다발에 옮기려 하다 그만두었다. 작고 흰 꽃은 좋아하는 꽃이었지만 사실 매일같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떠올려서였다. 달밤의 숲, 흰 꽃, 저와 똑같이 혼자였지만 웃고있던 그, 그래서 '특별' 했던 그.
저의 마음은 애초부터 동경이 아닌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저의 손을 감싼 손들을 들어올려 턱에 가져간다. 그의 손등에 살며시 내렸던 턱을 타고 둥글게 올라 손등에 입술을 맞대고 싶었다.
"산군님께서, 아니, 당신이 산군님이어도, 산군님이 아니라도. 꽃다발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당신은 저에게 '특별'해요."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저의 마음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저의 앞에 한 무릎을 꿇은 그를 보며 가슴이 아릿했다. 저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더라면, 당신이 손을 다칠 일도,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을텐데. 눈망울에 눈물이 차오르다 넘쳐흘러 떨어졌다. 좋아하는 이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이렇게 애달프지만 기쁜 것이었다면, 저가 그에게 하고 싶었다. 눈물이 입가에 들어오는 것에도 신경쓰지 말고 웃는 얼굴로, 목소리도 제대로 떨지 않고, 작게 말하지도 않고 말했다. 부디 저의 얼굴과 목소리가 흉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며.
"좋아해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
353 이름 없음 (3174372E+5) 2018. 7. 22. 오후 10:13:03>>352
산군주입니다. 지금 울고있습니다. 허이잉 。゚(゚´ω`゚)゚。 토끼(?) 뭐 뭐라고 불러야할지 모르겠지만 토끼양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러블리큐트뽀짝페어리쏘큐트.....ㅜ ㅜ ㅜ설레는 가슴 부여잡고 죄송한 소식 하나.....내일모래 돌아올게요 ㅜ◇ㅜ.....!!! -
354 이름 없음 (9244608E+5) 2018. 7. 22. 오후 10:49:32>>353 헉 아녀 산군주 토끼 얘는 뭐 클리셰 모아모아 공굴공굴(???) 하는 애고 저야말로 산군이가 완전 쏘스윗해서 교통불안광란의질주브레이크고장달린다나부스터오오오옹하고 있었는데요!! ㅇ0ㅇ 네네ㅔ네넹 잘갔다오세여 «٩(*´∀`*)۶»
-
355 이름 없음 (0386393E+5) 2018. 7. 23. 오전 2:00:26>>346
"그정도라면 노력은 해보일께요"
그에게 달려들어 몸을 다시 꼭 껴안는다 첫만남의 데자뷰지만 이내 그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거리를 두는 그녀 둘사이에 어색한거리가 생기고 분명 첫번째와 두번째 만남에서는 한점 수줍음 없이 그를 도륙했던 여자가 이제는 얼굴을 상기시키며 둘의 손을 조심스레 연결시킨다
그의 의견을 다분히 참작한 결과로 오히려 주문한 사람이 당황스러울정도로 여자의 태도가 바뀐다 그가 사랑을 키워드로 생각한것이 잘 먹혀들어가는듯 하다
"그럼 이제 미뤄뒀던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해요 식순은 제가 준비했으니 자기는 편하게 있으셔도 된답니다 어짜피 사지를 자를테니 움직일수도 없으실테지만"
방금 했던 생각이 무색할정도로 무척이나 원점으로 돌아온 내용 그녀스스로는 사지를 자른다는 말을 했으니 나름 뿌듯해보인다 시종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위해 어제처럼 그의 팔다리를 무감정으로 뜯어내고 한쪽에서 그녀의 재력을 과시하듯 웨딩드레스를 라인별로 색깔별로 이 감옥을 천으로 꽉 채울듯이 가져온다
사랑하는 눈으로 잘려진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보라색 눈동자가 반짝이며 소녀같이 투명하고 순수하게 빛나보이기도 하는 반면 이제껏 그를 괴롭히던 깊은 광기같이 그의 붉은 눈을 집어삼킬듯 미쳐보이기도 한다
"그의 날개와 비슷한 색깔인 이것이 좋을것같아요"
보통의 웨딩드레스와는 다르게 검은 레이스로 투명감이 있는 머메이드드레스를 고른다 레이스 온몸을 뒤덮고 있지만 동시에 언뜻보이는 흰피부가 어우러져 마치 레이스조차 그녀의 피부같은 착각이 느껴진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자기?"
몸통과 머리밖에없는 그를 시종들은 의자에 올려 그녀와 마주보게 만든다 -
356 이름 없음 (5387743E+5) 2018. 7. 23. 오전 10:29:53>>353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으나 어째선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 순간 그 긴장이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고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원점이로군, 계속해서 열뻗치는 상황에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의자 위에 올려진 그는 천천히 심호흡하며 그녀를 보았다.
" 뭘 입든 상관없다, 사지가 잘린 상대와 결혼한다니 생각만 해도 우습군. "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역안으로 변하며 날개가 날카롭게 변해 가까이 선 시종 두셋의 목을 베어낸다.
벌써부터 다시 돋아난 팔다리로 의자에 제대로 걸터앉았고, 제 역할을 끝낸 날개는 망토와도 같은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 이해가 안 된듯 하니 다시 한 번 말하지, 내게 뭘 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라. "
경매장에 잡혀있던 건 손발이 으깨지는 게 싫어서인 것도 있었으나.
적어도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냥꾼들에게 지독하게 시달리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경매장은 썩 나쁜 곳은 아니었지, 꽤 관리도 해줬고.
그런 의미에서 경매장 평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었다...
라는 허울 좋은 거짓말을 머릿속에서 치우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 억지로 고통을 주려고 하지만 않으면 웬만큼 협조해줄 테니, 잘 생각해보란 말이다. "
죽을 수도 없는 몸이니 이미 오래 전에 삶에 대한 것을 포기했다, 희귀품에 해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지.
그건 이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 그렇게 사지가 잘린 게 좋다면 몇 명이고 사지를 잘라서 내어주지. " -
357 이름 없음 (138915E+51) 2018. 7. 24. 오전 11:25:00>>352
기억해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산군의 자리에 오른 뒤로는 매일같이 시비를 걸어오던 같은 맹수들도 더이상 자신의 눈에 띄지 않았고, 산에 사는 모든 이의 경외를 받게 되었으나 정작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다. 원래 이 자리는 이렇게 외로운 자리였던가? 아니면 나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하는 자리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임은 분명했으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의욕을 잃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흥청망청 놀기 시작했다. 어차피 얼마 오래가지 못할 연애놀이도 했다. 몇몇 문제는 과격하게 해결했다. 일종의 반발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점점 과장되가는 것을 느꼈으나,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허무함이 도통 메워지지 않아, 가끔 잠이 오질 않았다. 그 날은, 바로 그런 날이었다. 설령 자신이 산군임을 몰랐었다고 해도, 너만은 나를 나로써 대해주었지.
지금도 그렇다.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 산군임을 잊고 손바닥을 핥아준 것이겠지. 저렇게 얼굴이 붉어지다니 미칠듯이 귀여웠다. 꼬옥 껴안아주고싶다. 괜찮다고 속삭이며 붉어진 네 볼에 입을 맞춰주고 싶다. 머리카락을 넘겨주고싶다. 그런 생각들이 막힘도 없이 술술 튀어나오는 것에 본인도 놀라 얼굴을 붉혔다. 분명 바보같겠지. 호랑이와 토끼 수인이 서로 마주보며 얼굴을 잔뜩 붉히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자신의 마음을 전부 꺼내놓고 고백한 산군은 마음을 비우고 대답을 기다렸다. 각오는 해두었다지만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이내 자신의 손등에 턱을 얹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울음기가 가득한 눈으로, 그러나 이 산의 어느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웃는 얼굴로 좋아한다는 대답을 들은 산군은 마치 수백년 된 고목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3초 뒤, 양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특별하다.
“─~~.”
산군은 당신의 작은 어깨에 팔을 감아 끌어안았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살포시 끌어안고서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이라도 산군의 위엄을 보았던 자들이라면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겠지. 당신의 품은 산군이 안기기엔 너무나도 아담했지만 서로의 온기는 온전히 느껴졌다. 당신에게선 산군 자신이 따온 꽃들과 비슷한 향이 났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못볼 꼴을 보여주고 말았군. 미안하네. 너무 기쁜 나머지…”
시간이 흐르고 진정하고 난 다음, 산군의 눈은 우습게도 퉁퉁 부어있었다. 나도 너를 좋아한다고 하였고, 너 역시 나를 좋아한다고 해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지……? 가슴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여전히 혈액순환이 안되는데 그보다도 더 어색함이 한층 앞섰다.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고싶은데 자꾸 이상한 꼴만 보여주지 않는가. 아까와는 다른 느낌의 부끄러움으로 귀가 새빨개졌다. 산군은 슬쩍 고개를 들어 당신의 얼굴을 보았다.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
358 이름 없음 (2224156E+5) 2018. 7. 24. 오후 2:22:51-절그럭, 절그럭......
한치 앞도 안보이는 동굴 속, 먹물을 푼것 마냥 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속으로 부터 이질적인 사슬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슬 소리에 맞춰서 무언가 어둠 속으로부터 움직인다,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겠지.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공동인데 이 공동에서 잠깐 몸을 숨길만한 곳이 없을까, 그렇게 착각이 이는 순간 침입자는 한 구석으로부터 무언가가 자신을 응시하는게 느껴진다. 아주 자그마한 시선, 그러나 그 눈빛은 마치 모든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특이하군, 제물이 끊긴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이제서야 제물인가. 그것도..... 단 하나.]
파충류? 아니면 기타 다른 동물? 시선은 마치 재밌다는 듯이 천천히 자신을 향하여 눈을 데룩데룩 굴리고 있었다. 머리로부터 전해지는 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중성적인 느낌이었고, 앞에 있는 존재는 마치 살아 있으면서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나에게 짧은 시간이면 인간들에겐 긴 세월이겠군, 그렇다면 제물로 들어온것도 아니겠고......]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천천히 눈을 지긋이 감았고 조금은 흥미가 생겼다는 듯이 시선을 향해 돌리며 입을 열었다.
[꼬맹아, 바깥에 뭐가 있었지. 대답여하에 따라..... 좋은걸 줄지, 나쁜걸 줄지 생각해보마.] -
359 이름 없음 (7913531E+5) 2018. 7. 24. 오후 9:15:50>>357
가득 맺히는 눈물이 눈앞을 수시로 가려버려 산군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순간이라도 눈길에서 놓고 싶지 않은 임이었다.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고, 보고 있어도 그리웠다. 윤곽으로만 보이는 산군님이 아까워 부러 눈을 깜빡여 채 맺히지 않은 눈물을 뺨 아래로 떨구어냈다. 흐릿해지다 또렷해지기를 반복하며 미동없이 저를 보는 그 모습을 할수만 있다면 어디에든 새기고 싶던지. 몇번을 말해도 모자란 것 같은 저의 마음을 밖으로 자아내려 할때, 맞잡은 손등을 타고 퍼져나가는 물기가 턱을 적시는가 싶더니 뺨을 타고 저의 눈물자국을 따라 새로이 흘러내렸다. 방울방울 아래로 떨어져내리는 눈물방울이, 저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울음소리가, 저의 별 볼일 없는 그릇과 걸맞지 않게 넘쳐흘러 미처 다 안길 수 없었던 든든한 온기가 너무나도 귀하고 애틋했다. 그의 눈물이 저를 적시자 흘러내리는 눈물에 옮을 것 같이 코 끝이 먹먹하다. 부드럽게 몸을 감싼 포근하고 너른 품이 지나칠 정도로 따뜻해 온 힘을 다해 그 온기에 매달렸다. 고요함이 눈치를 보다 조금씩 주위로 몰려들었다.
"...산군님께 못볼 꼴은 없어요. 제 눈에는 매우 진실하고, 솔직하고..."
도리질을 치며 등 뒤에 양 팔을 올려 한껏 끌어안았던 산군님의 가슴팍에서 얼굴을 떼어냈더니, 때맞춰 눈이 마주치게 되자 뒤늦게 저의 꼴이 신경쓰였다. 그렇지 않아도 눈이 붉은데, 울어서 핏발이 설 정도로 충혈되었으리라. 줄곧 붉었던 얼굴은 울음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으리라. 이런 꼴을 산군님께 보이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감정의 잔재와 기억의 잔해들이 어우러져 앞길이 캄캄했다. 산군님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못난 얼굴을 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 스스로 산군님의 품에 얼굴을 붙이고 다급하게 속닥였다.
"보, 보지 마세요. 좋아하는 분께 보일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건 뭘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같은 수인과도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서로 좋아한다 말을 나누게 된 후에는 어떤 교류를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심장소리가 안정을 준다. 따뜻함이 여기에 실재했다. 산군님의 품속에 숨어든 눈망울이 꿈결같은 기쁨에 달뜨고 사르르 미소가 떠올랐다.
"저어, 산군님...연애...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보고 들은 걸로는 좋아한다고 말한다. 자주 만나러 간다. 같이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껴안기도 한다고 한다. 산군님은 고백은 처음이라고 했으나, 소문에 연애는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시지 않을까 싶었다. 얼굴을 숨기겠다 안겼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은 얼굴에 피가 수십번도 몰리는 날이었다. 높아지는 저의 체온과 콩닥거리는 가슴 때문에 숨쉬는게 힘들지경이다. 입술을 오물거리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도 오물거렸다.
"저...그게...그러니까, 그게...산군님께서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산군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문으로만 산군님을 아는건 싫어요...산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들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그리고, 그리고, 또..."
가쁜 숨을 고르기 위해 가슴을 꾹 움켜잡는다. 터질듯한 마음을 소리로 하기에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조그마한 목소리가 싫기도 하고 다행이었다.
"제가 산군님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
360 이름 없음 (9821519E+5) 2018. 7. 25. 오전 12:06:28톡, 눈송이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작고 여린 눈송이를 뭉쳐 주먹만한 뭉덩이로 굴려낸 뒤 그것을 힘껏 던지자 일어난 일이었다. 뭉쳤다 흩어지는, 자연의 섭리에 이끌려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푸른 사내가 이내 제 손을 툭툭 털며 한껏 숙이고 있던 허리를 단번에 곧게 펴버린다. 밤하늘을 따온 듯 짙은 남빛깔의 눈동자가 한 번 데구르르 굴러 주위를 살피자 새하얀 눈을 닮아 하얗게 질린 피부는 어째서일지 선홍빛으로 물들었다. 척박한 눈밭에서 억세게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마냥, 수줍게 피어오른 선홍색 빛깔은 그 하얀 눈밭에서 유일히 색채를 가진다. 바람이 푸른 사내의 머리칼을 한 번 쓰다듬고, 어둠이 그의 귓가에 노랫말을 속삭이고 나서야, 그를 녹일 듯 선명히 빛나는 주황빛 물결이 하늘을 덮어낸다.
“ 쉿, 다들 조용히. 태양이 뜨고 있어. “
묘하게 기대감이 가득 차 찰랑이는 목소리로 그가 나무랐다. 적막하기만한 눈밭을 내려다보며 한껏 제 인상을 찌푸리던 사내는, 무엇을 보았는지 화들짝 놀라며 제 뒤로 삼십 보 가량 떨어져있는 오두막을 향해 재빨리 발걸음을 내던졌다. 나약한 유리공예품과 같은 그 몸이 역동적으로 흔들리고, 그의 숨 또한 가빠졌다.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위태로운 그 몸뚱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문고리를 잡아챈 그가 급박히 오두막 안으로 몸을 피한지 겨우 몇 분이 지났을까. 적막을 깨고 금빛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나는, 저 목소리를 아주 잘 알지. 사내의 눈이 이유 모를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 어서 와. 그..., 방금 정신이 들어서. 나는 잠같은 거, 못 자니까. 응. “
가느다랗게 흔들리는 목소리가 퍽 수줍음을 타는 어린 아이같더라.
그 가엾은 눈송이는, 녹아내릴 것을 알면서도, 태양에게 닿으려 했다. 그것이 사랑이라 굳게 믿으며.
# 태양의 신을 사랑한 눈의 신..., 같은 느낌...! 태양에 닿으면 녹을 것을 알면서도 태양을 사랑한 눈의 동화라고 생각해줘! -
361 이름 없음 (3386872E+5) 2018. 7. 25. 오후 1:50:46>>359
너무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붓진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즈음 겨우 침착하게 있을 수 있었다. 당신의 눈물이 별똥별처럼 뺨을 타고 흘러넘치는 것을 바라보던 산군은 가느다랗게 웃었다. 정말 이상한 점에서 닮았다.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똑같은 것으로 울며, 똑같은 것으로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닮아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군은 네 얼굴에 입술을 가까이했다. 눈물이 고여있는 뺨, 코 끝, 눈가 아래에 차례대로 조용히 입을 맞춘 뒤 여전히 뺨을 붉힌 얼굴로 수줍게 웃었다.
“어째서 내겐 못볼 꼴이 없고, 네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 더이상 네게 산군이 아니다. 연인이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랑하게 될 모습들, 지금까지 봐왔던 내가 사랑했던 모습들, 그리고 바로 지금 사랑하고있는 모습들까지 전부 담아두고싶네. 매우 진실하고, 솔직한 이 눈으로.”
산군의 황금빛으로 은은히 빛나는 눈동자가 당신을 향했다. 당신이 아마도 처음 겪는 일에 곤란한 듯 보이니 다시 한 번 자신의 서두름을 반성했다. 조금 더 천천히 가까워지는 방법을 택했어야했나. 그렇지만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눈동자를 하고있었다. 서로의 깊은 내면에 박힌 쓸쓸함의 조각들이 공명한 걸지도 모른다. 진심이었다곤 하나 섣부른 고백을 받아준 네가 고마웠다. 이렇게 집착하게 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고. 당신이 다시 산군의 품 속으로 숨듯이 파고들자, 산군은 기뻐해야할지 아쉬워해야할지 모르는 얼굴로 눈을 가늘게 휘며 웃을 뿐이었다. 그 뒤를 따라온 질문에 같이 휘어진 눈썹이 제 위치로 돌아갔다. 연애, 라는건.
“같이 꽃을 따러가자. 이번엔 서로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에 다치지 않고 따는 법을 알려주게. 같이 숲을 거닐자. 손을 잡고, 풀향기를 맡으며 하염없이 걷고 지치면 가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서로 어깨를 기대기도 하면서. 같이 달을 보자.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연애겠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네.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연애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방금은 그저 내가 하고싶은걸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러니 너도, 네가 나랑 하고싶은 것도 알려주게.”
산군은 머쓱하게 웃었다. 자신을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당신의 등을 살포시 토닥여주었다. 그런가, 그런 생각을. 산군 자신은 딱히 자신에 대해 나도는 이야기들을 신경쓰지 않았고 반 정도는 진실이기에 어떻게 해명해야할지 감이 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저렇게 생각해주고 있다. 단순히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을 뿐더러. 너의 그런 세심한 점들이 산군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말, 너란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가슴이 커다랗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네가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정하자, 진정. 마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네 말이 이어지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리고 또……
“…….”
저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천하의 산군이라도 너의 터질듯한 목소리에 휘청거렸다. 이내 쓰러지듯이 당신의 목에 코를 박고서 잔뜩이나 붉어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 잠시만 이렇게 있어줘. …나도, 나도 연애를 하고싶어. 오직 너랑만.”
아픈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그만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산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다시 입을 열었다.
“다시 한 번 자기 소개를 해야겠네. 계속 산군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불편할테니. 내 이름은 바류일세. 아니, 바류다.”
#평소엔 위엄있게, 부끄러울 땐 반말 *'◇'* -
362 이름 없음 (2495701E+5) 2018. 7. 26. 오전 12:50:29>>361
목덜미로 다가오는 것들은 무엇이든 무서웠다. 저가 완전한 동물이 아닌 수인이라 하더라도 눈에 잘 띄게 되어 위협받았던 경험들로 인해 목을 물릴것 같은 기분이나, 목줄이 저의 목을 얽매일지도 모를 것 같은 상상들이 발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산군님의 얼굴이 목에 가까워지려는 것을 보고 움츠러들게 될 저의 모습에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두려움과 뒤섞여 충돌하다가 두려움을 덮고 넓게 퍼져나갔다. 공포가 저의 심장을 쥐고 으스러트리지 않았던 기념비적인 날인 것이다.
저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기적은 산군님의 덕이었다. 다른 이의 콧잔등이 목에 닿고, 더운 숨이 목덜미를 간질이고, 나직한 목소리가 귀에 내리깔리듯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나오는 아찔한 탄성의 첫 음을 집어삼켰다. 저에게서 나온 이상한 소리가 설마 들리지는 않았을까 조마조마한데 이상하게 가슴은 다른 쪽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설렘에 떨리고 애절함에 뛰었다. 팔딱거리는 심장의 건너편에서 저와 버금갈 정도로 뛰고 있는 산군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좋아하는 임에 대한 애절함은 붉은빛으로 색을 이루어 머리에서 시작해 목덜미까지 내려갔다. 불덩이를 삼키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 들어간 것만 같이 갈증이 일어 가장 갈구하는 것을 찾아 입술을 축였다. 저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우연이라지만 입술이 닿은 곳은 이 사랑하는 사람께서 저에게 갈증을 일게 만든 부분에 흡사하게 목덜미였고, 가만히 있기에는 아까의 추태가 다시 걸려 좋아하는 이와 이후로 어찌 해야할지 어색해 그저 그의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어깨와 목선을 따라 저의 숨과 하관을 흘렸다. 누구도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아 가장 먼저 서로의 이름을 마주하는 건 네개의 귀였다.
"...제 이름은 이나에요. 산군니...아니, 바류님."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는 기쁨이 여기에 있었다. 다른 이들이 부르기 어려운 이름을 부르며, 다른 이들이 부를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이름을 수줍게 입에 올리자 괜스레 웃음이 나와 미소가 지어졌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자신이 달라지는 기분이다.
"같이 있고 싶어요. 기쁠 때면, 슬플 때면 이렇게 껴안고 싶어요. 추울때도 껴안고 있고 싶고, 더울 때는 같이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밤에 졸리겠지만 해가 떠 있을때도 몰래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란 듯이 같이 다니고 싶어요. 매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처럼.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해 나가자 지금이 그 만남과 같은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 달라진 게 저의 마음을 알게 된 것과 돈독해진 사이를 빼면 있을까.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미소는 어느새 웃음이 되어 한껏 맑았다. 떨어져 있던 저를 위한 꽃다발을 주워 다시 품에 안고 산군님과 시선을 마주했다. 얼굴에는 아직 홍조가 남아있었지만 오늘 처음 제대로 눈을 마주할 수 있었던 순간이라 괜스레 쑥스러워져 말을 더듬었다.
"저, 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어떡해. 뺨을 감싸쥐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댔다.
::그런...설정은...반칙이다...범인은 바ㄹㅠ...는 엔딩의 기운이 넘실거리게 나왔는데 준비할까요? -
363 이름 없음 (0507788E+5) 2018. 7. 26. 오후 12:57:00>>362
야생동물의 감은 날카롭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마주한 상대가 정녕 피를 보려고 하는지, 겁에 질렸지만 허세를 피우고 있는지,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얼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얼굴 근육이나 미세한 몸동작의 변화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산군에게 있어 주된 정보원은 향이었다. 그 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너는 지금 겁에 질려있다. 또 그것을 숨기려한다. 아마도 자신이 갑작스레 목덜미 부근에 다가간 탓이겠지. 연인으로써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본다면 당신이 겁에 질린 것도 당연한 이유에서이다. 복잡한 감정이 뒤덮인 눈으로 너의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 자신은 납득한다. 겁에 질려 자신을 밀어내더라도. 성급한 자신 탓이다. 단지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산군은 조용히 당신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향이 바뀌었다. 안정, 편안함, 설렘, 애정. 이런 향을 이렇게나 가까이서 맡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놀란 산군의 얼굴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머리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내린다. 너는, 정말로 용기있구나. 심지어 밀려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보다도 더. 정말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기만 하는구나. 스며들고 스며들어 결국엔 너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너의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지막히 웃었다. 울듯이, 웃었다.
“이나. 참으로 고운 이름이야. 이나. 이나.”
네가 지금 짓고있는 미소만큼이나. 산군은 혹여 입에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날아가버릴까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네 이름을 중얼거렸다. 이나, 날 좋아하는 이나. 내가 좋아하는 이나.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빈 칸을 채워가다보니 어느새 새로운 네가 미소짓고 있었다. 새롭게 채워나갈 너와의 감정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
“그러하자. 우리에게 시간은 많으니.”
네가 하고싶어하는 일들에 빠짐없이 자신이 들어있음을 깨닫곤 눈꼬리가 곱게 휘어졌다. 어느새 몸은 떨어져, 네가 꽃다발을 줍는 모습을 지켜보던 산군은 본인 역시 자세를 똑바로 했다. 적다고 할 수 없는 키차이이기에 너를 내려다보아야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를 올려다봐준다. 그러한 일치감에 가슴 속 일렁임을 느꼈다. 둘 다 서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로의 눈동자만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의 세계. 마음 속에서 뻗쳐진 수많은 길들이 오직 너에게로만 향하고 있다. 내가 오직 네게 가도록, 네가 오직 내게 오도록.
“그 뜻은 서로 열심히 좋아하자는 뜻이겠지?”
마지막까지 말을 더듬는 네게 방긋 웃으며 농을 걸쳤다. 그리고 산군은 손을 뻗는다. 거칠게 뽑아 가시가 떨어져나간 꽃 한송이를 꽃다발에서 뽑아냈다. 조심스레 너의 옆머리를 넘겨주고, 꽃을 꽂아주었다. 예쁘다. 작게 중얼거렸다.
“잘 부탁한다, 이나.”
#zㅋㅋㅋㅋㅋ짠! 이나주의 말을 듣고 엔딩을 내보았습니다! 짧지만 긴 시간 같이 돌려주어서 고마웠어 XD*!!!!!!!1 이나 천사....이나 페어리...이나 쏘 큐트....ㅠ ㅠ ㅠ ㅠㅜㅠ몇번이나 다시 읽으면서 이나 여신님 영접했습니다 8ㅁ8* 둘 앞에 꽃길만 있기를....! (꽃잎날리기 -
364 이름 없음 (2495701E+5) 2018. 7. 26. 오후 10:16:03>>363
좋아하는 마음에 부족함은 없을텐데 아무래도 저가 말을 잘 못 한걸까. 농을 농으로 듣지 못하는 어벙함은 천성이라 한다면 천성이었고, 교류를 많이 하지 못해 익힌 습관이라면 습관이었다. 어찌 고쳐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머리를 거쳐, 좋아하는 이의 손가락이 머리칼을 쓸고 부드럽게 내려와 뺨을 스치웠다. 다정함이 묻어나는 손끝이 꽃줄기를 걸친다. 그 손짓으로도 귀가 파르르 떨리는데, 산들바람처럼 지나가는 저를 향한 칭찬이 간지러워 눈맞춤에 파동이 일었다. 파동을 숨기려 괜히 그를 따라 꽃다발에서 꽃줄기를 뽑아내 엮고 시원스럽게 뜯어져나간 가시 자국을 이용해 가슴에 솜씨좋게 걸었다.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아서 무의식적으로 귀를 파닥거렸다.
"바류님, 바류님, 바류님, 바류님, 바류님..."
고맙다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외에 형태로 할 수 없는 수 많은 말들을 이름에 꾹꾹 눌러담아 연신 불렀다. 말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부족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으나 산군의 좌에 앉아있는 그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속으로만 뇌까리며 끝내 입에 담게 되고 마는건 이번 한 번만 불러보고 싶은 연인의 이름 단 두자였다.
"바류."
꺼질 것처럼 갸날픈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밖에 꺼내본 이름은 금방 사그라드는 울림만으로도 가슴에 애절하게 남아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가 들었기를, 아니 듣지 않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이 대립하기에, 그저 건방지게도 그 두 글자 만을 말하지 못한 바보같은 저의 마음이 전해지길 기도한다. 가시와 고독으로 생채기가 붉게 어린 그의 손에 저의 손가락을 얽어매었다. 보잘것 없는 손이지만 그의 뿌리가 될 수 있었으면 했다. 남은 손도 얽어둔 손에 살며시 가져가 이것이 바람막이 되어 그의 지지대가 되길 바랐다.
"같이 숲 속을 걷고 싶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꽃을 따고, 같이 달을 보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같이, 같이, 같이. 혼자가 아님이 기꺼웠고 꿈을 꾸는 것 같았으나 꿈이 아님이 기쁘고 옆에 있는 이가 사랑하는 임이라 행복했다. 손을 맞잡은 연인이 가깝다. 머리를 모로 숙여 팔에 기대고 그를 부드럽게 이끌면서 두근거리는 가슴 대신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하고 싶은 일들은, 좋아할 시간은 숲 여기저기에 걸리고 널려 찾기를 기다린다. 금방 찾아낼 수 있으리라.
딸랑딸랑, 숲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 서로 부딪히는 꽃망울이 선심쓰듯 향긋한 향을 내뿜으며 연인들을 배웅했다. 차갑게 한 존재를 내려다보았던 달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두 존재를 지켜보았다.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며 누가 언제 몸을 꺾을까 경계하던 수풀들도 가시와 뾰족한 잎들을 아래로 숙이고 두 존재가 움직이는대로 흔들렸다. 누구에게는 특별한 날이었고, 이후로는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이 되겠지만, 그 매일매일은 새롭게 펼쳐질 것이었다.
::산군이=바류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참치에게 그랜절 올립니다ㅜㅜㅜ 안이 일케 심쿵한 아이를 무슨 생각하면서 만드신거져 너란 참치 무서운 참치...지구 뿌실 뻔했잖아욬ㅋㅋㅋㅋ 둘은 바류세데스 벤츠가 있으니 꽃길 걸을 거에여...저도 읽은거 또 읽고 재미있게 돌렸어요! 엔딩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65 이름 없음 (4279422E+5) 2018. 7. 29. 오전 10:48:16“그쪽, 귀신이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의 삶에 간섭하려 드는거, 안좋은 습관이거든요.”
아직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질을 갖고있는 소년은 시큰둥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홀짝인다. 그의 나이 또래라면 모두 학교에 갔을 시간. 한가로운 낮의 공기가 공원 가득 퍼져있다. 지겹도록 옆에서 쫑알거리고 있는 귀신을 애써 무시하려 들지만 정신이 사나워 결국 한숨을 내쉬고 만다.
“뭐, 어떻게 해줄까요. 퇴마? 제령? 아니면 뭐, 원한이라도 풀어드려요? 지박령이시면 찾기 쉬워요. 여기 CCTV 많으니까.”
#난입 자유! -
366 이름 없음 (0424523E+5) 2018. 7. 29. 오후 5:02:30>>365
“ ... “
소년의 말을 잠자코 듣던 소녀가 느릿히 제 눈을 깜빡였다. 한가로운 공원의 생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소녀는 이윽고 핏기 없는 제 오른손을 만지작거리며 한바퀴 제 눈동자를 굴려냈다. 그 소녀의 죽은 눈동자로 확인한 공원의 모습은 공백의 적막함으로 가득 차오른 상태였다.
“ ...아니, 그냥... “
소녀의 입술이 머뭇거렸다. 무언가를 말하려 달싹이다가도, 이미 죽어 기능을 잃어버린 성대는 결국 울리지 못 했다. 덤덤한 소년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소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이름 모를 풀꽃을 한 번. 삶의 생기가 없는 것은 오로지 자신 뿐이란 걸 다시금 곱씹으며 소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 나랑, 친구할래? “
아마도, 제대로 미친 소리였다. -
367 이름 없음 (4279422E+5) 2018. 7. 29. 오후 5:19:44>>366
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저렇게도 뜸을 들이는 것인가. 지금까지 만나본 귀신들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하려는 짓들은 대부분 똑같았다. 몸을 뻇으려들거나, 장난을 치려들거나, 아니면 평일에 교복입고 나와서 맥주 마시는 본인에게 훈장질 하는 꼰대 타입까지. 아무튼 대다수의 귀신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경험은 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도 가볍게 넘길 생각이었다. 생각보다 끈질기게 붙어와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지만, 아무튼 소년은 귀를 기울이는 둥 마는 둥 공원의 따스함을 즐기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조금 뿜어버렸다. 축축해진 옷자락과 갈 곳을 잃어버린 동공으로 소녀를 바라본다. 진심이냐는 듯이.
“……제가 섬세하진 못해서 이런 말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왜 귀신 친구가 아닌 꼭 사람 친구여야만 하는데요?”
톡톡 쏘아붙이는 말투는 오직 소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소년의 타고난 성격인 듯 싶다. 아무튼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묻고나선 주머니 속 티슈로 입가를 대충 슥슥 닦았다. 친구가 되어달라니, 우습게도 소년은 그 말을 산 자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빌어먹을 특성을 타고난 자신과 가까이하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귀신을 친구로 삼을 정도로 정신이 망가지진 않았다.
“죄송하지만 안돼요. 귀신하고 친구 먹는다는건 듣도보도 못했어요. 설마 방심했을 때 제 영혼을 뺏어가려는건 아닌가요?” -
368 이름 없음 (0424523E+5) 2018. 7. 29. 오후 7:04:50>>367
소녀의 눈동자가 가볍게 흔들렸다. 소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음료가 옷을 적실 때도, 저를 바라보는 동공이 흔들릴때도, 무심히 톡톡 쏘아붙이는 말투로 소년이 입을 열었을 때도. 소녀는 그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둥실 떠오르는 눈동자로 소년의 주변을 훑어낼 뿐이었다. 그래, 어떤 인간이 귀신과 친구 먹을 생각을 하겠어. 이미 삶을 다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였다만, 소녀가 제 고개를 푹 수그리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리도록 차가워, 차마 인간의 것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한숨이었다.
“ 안 돼? “
참으로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다. 소년의 질문을 하나의 물음으로 응집시킨 그녀는 이내 소년이 앉은 벤치로 다가가 소년의 옆자리에 사뿐히 앉기까지 했다. 귀신이지만 사람의 형태이며, 흐릿하나 사람의 형태이다. 이따금 귀신 중에는 자신의 생이 끝난 그 순간의 모습이 귀신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온 몸에 피칠갑을 하거나 머리 한 쪽이 완전히 부서져있거나, 무언가에 목이 졸려 흉측히 늘어난 상태로 이승을 떠도는 이들이 있다곤 했다만 다행히도 소녀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처연한 눈동자도, 길다란 머리칼도. 다만 그 모든 것이 생기를 잃은 껍데기 뿐이었더라. 소녀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런 짓을 해봤자, 친구가 사라지는 건 똑같으니까. “
짧은 한 마디를 마쳐낸 소녀가 조용히 제 고개를 돌려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인간 소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 형태가 명확한 소녀였다. 다만 손끝이 희미하게 번져가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었을까. 소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금 입을 열었다. 공원 위로 내리쬐는 햇살 때문이었을까, 삶을 다한 눈동자가 처연히 빛나고 있었다.
“ ...친구, 안 해? 잠깐만 해주면 돼. 어차피••• “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소녀는 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히 고갯짓을 하며 몸을 일으켜 내는 것이었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소년의 대답을 알 것만 같았다. -
369 이름 없음 (4279422E+5) 2018. 7. 29. 오후 7:28:28>>368
꽤 재현율이 높은 귀신이다. 대부분의 귀신이 죽기 직전의 모습을 따라간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사람 같은 귀신은 본 적이 없다. 서늘한 기운과 희미해진 손 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일반 사람으로 착각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소년은 미심쩍다는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며 여름 햇빛에 미적지근해진 캔맥주를 마저 들이켰다. 차가운 한숨, 그렇다고 귀신 특유의 억지를 부리며 끔찍한 몰골로 붙잡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점들은 자신의 긴장의 벽을 살짝 허물어주었지만 어차피 거기까지였다. 귀신하고 친구라니, 있을 리 없지.
“안됩니다. 안해요. 제가 이렇게 어차피 또래일 것 같은 당신에게 꼬박꼬박 말을 높이는 것도 귀신이랑 반말까고 친해져봤자 좋을 일 하나 없어서라고요.”
소년은 단호하게 쳐냈다. 더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그녀와 친구가 되는 것이 제령의 힌트가 되어줄지도 몰랐지만, 소년이 친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별 거 없었다. 그는 퇴마사도 무당도 성격 좋은 선량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저 한가롭게 놀 뿐이고, 이 세상에 대해 신물이 나서 항상 가시를 세우고 다니는 소년일 뿐. 친구란 족속도 없었고, 가족도 없다. 가족 비스무리한 건 있다하더라도 없는 셈 쳤다. 소년은 벤치 등받이데 등을 기대고 자연스레 옆에 앉은 소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대체 뭐가 목적이지? 저 처연한 눈빛을 보니 더이상 파묻기도 힘들고 귀찮다. 그저 자신이 이 공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될 일이다. 소년은 자리서 몸을 일으키려했다.
“……어차피, 뭔데요?”
털썩. 소년은 일으키던 몸을 다시 벤치에 앉히고 퉁명스레 물었다. 단순한 변심? 동정? 호기심? 아니, 그저 햇빛이 발 앞까지 와있어 그늘에서 벗어나기 싫었을 뿐이다. -
370 이름 없음 (0424523E+5) 2018. 7. 29. 오후 7:51:25>>369
단호한 소년의 대답에 소녀는 느릿히 제 고개를 끄덕였다. 멀쩡한 인간이 아닌 이상 귀신과 친구를 하고 싶어할 이는 없을 게 뻔했더라. 소녀는 흐릿하게 번져가는 제 손과 선명한 형태를 띄우는 제 몸뚱이를 물끄럼 내려다보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생이 끝난 이후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그 얫날, 그 찬란하던 여름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얼풋 본다면 소년과 같은 또래의 친구로 보였을 법한 외관, 다만 차이점이라면 생이 끝난 자와 생이 끝나지 않은 자라는 것일까. 소녀는 더 이상 친구라는 단어를 내뱉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익숙한 일이었다.
" …친구, 아니잖아. "
일으켰던 몸을 다시 벤치에 앉히는 소년의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던 소녀가 나지막히 대꾸했다. 제 발끝 앞으로 찾아온 햇빛을 한 번 밟아보고, 살며시 고개를 돌려 저에게는 그려지지 않는 그림자를 찾아보고 나서야, 소녀는 느릿히 고개를 떨구며 제 입술을 달싹였다. 햇빛에 녹아내리지 않아 다행이야. 온기 없는 영혼에게서 흐르는 한기가 꽤 차가웠다.
" …어차피, 곧 소멸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친구 해주면 돼. "
한을 푼 것은 아니었다. 저승으로 가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 무엇도 바란 적이 없건만 달이 뜨면 뜰 수록 희미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애써 기억해내며 소녀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소년에게 말했다. 시선은 소년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흐려져가는 자신의 손끝으로, 그리고 다시 소년에게로. 여름날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코를 간질였다. 느낄 수 없지만, 느껴본 적 있는 감촉이었다.
" ...다시, 친구. 할래? "
희미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살풋 미소를 지어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완전한 그림자의 시간이 된 순간이었다. -
371 이름 없음 (0424523E+5) 2018. 7. 29. 오후 7:52:50>>370 아이구 얫날 - 옛날 오타났네ㅠㅠ
-
372 이름 없음 (4279422E+5) 2018. 7. 29. 오후 8:11:24>>370
“아, 거 되게 까다롭네!그냥 물어보는 것도 안되는건가요?”
멀뚱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머쓱함을 지우기 위해 괜히 신경질을 부린 소년은 자기 혼자만의 그림자가 땅에 져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살짝 움찔거렸다. 귀신이 어떻다느니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은 사람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랫만이라서. 새삼 자신 같은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건 귀신들 밖에 없는건가 싶어서. 귀신 보는 아이라고 멸시받던 그 시선들 사이에 파고든 귀신들이 자신을 보며 키득거리던걸 잊지못해서.
“정말 유감이에요. 여기 앉아있던게 나보다 좀 더 착하고, 남 신경 써주고, 덜 예민한 사람이었으면 당신도 편하게 친구 놀이 하면서 성불할 수 있었을텐데.”
소녀의 자초지종을 들은 소년은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희미하게 번져나가는 소녀의 손 끝을 바라보았다. 자연성불?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남겨진 한도 미련도 없이, 그저 구천을 떠돌다 홀로 성불하는 령. 그 중에서는 자신이 귀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타입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확실하게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다.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며 소녀를 바라본 소년은 그 손끝만큼이나 희미한 미소에 어꺠를 살짝 떨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소녀의 미소를 바라보기만 했던걸 깨달았는지 볼을 붉히며 고개를 꺾고 시선을 피했다.
“……참나, 친구가 뭐 하자고해서 하는건가요. 생전에도 친구 안사귀어본 티를 내시네요.”
유감스럽지만 소년이 말할 처지는 되지 않는다. 어느새 모든 공간이 구름의 커다란 그림자로 뒤덮여버렸지만 소년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차피 사라진다는 귀신의 친구 같은거 하고싶진 않지만, 어울려드릴게요. 그간 꽤 외로우셨을 것 같으니까.” -
373 이름 없음 (7548638E+5) 2018. 9. 2. 오후 4:19:26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멍하니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음악을 듣다가 가사에 흠칫 놀라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 옛적부터 친구였던 너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널 지켜보게 되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보자. 언제부터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음 속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도 심해 바닥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을까. 지루한 윤리시간에도, 즐거운 문학시간에도 검은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는 네 뒷모습만 보는 걸 넌 모를거야. 표정을 감추고 즐겁게 웃으며 오늘도 너에게 말을 걸게. 이건 너에게 평생 비밀이야.
"쉬는 시간인데 뭐해? 오늘 끝나고 집 가는길에 새로 생긴 빵집 갈래?"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너에게 간단한 제안을 할게. 거절하지 말아줘. 오늘도 이야기할 게 많단 말이야. 오늘은 새로 산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왔고, 토요일엔 아랍어를 시작했고, 일요일엔 막 수능특강을 끝낸 참이거든. 전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뭔가 일본 여름 냄새나는 풋풋한 학원물 애니 같은걸로 맞관 삽질 보고 싶어서 올릴게! 아무나 찔러줘 -
374 이름 없음 (4859441E+5) 2018. 9. 2. 오후 9:57:22>>373
바람이 살랑이는 게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푸른 하늘은 물감을 풀어낸 듯 선명하고 어여뻤으며 약간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은 그럭저럭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지. 막 필기를 끝낸 노트를 덮어내니 매끄러운 표지 위로 닿은 햇빛이 반짝여, 나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니 어느샌가 네가 다가와 있더라. 나는 말갛게 미소를 지으며 네 목소리를 담아.
“ 좋아. 나도 거기 가자고 말 하려 했는데. “
미소에 감정이 너무 많이 담기지 않게, 찰랑이며 선을 넘지 않게. 너무 많이 섞인다면 마음이 엿보일지 모르니까. 너의 물음에 나는 짧게 대꾸했다. 사실은, 어제 읽은 연애 소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또 오늘 아침 먹었던 새로 출시된 젤리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네 얼굴을 보고 있어도 좋을거야. 하지만 이건 비밀이니까. 나는 다시금 입을 열어, 의미 없는 단어들에 내 마음을 실어보내.
“ 아, 오늘 날씨 좋다. “
너를 보며 다시금 미소를 지을게. -
375 이름 없음 (2055972E+5) 2018. 9. 3. 오후 1:58:03>>374
내가 말을 걸자 고개를 들어보이는 너의 얼굴을 보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 멍하니 바라보다가 공기를 헤치고 내 귀를 울리는 너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뻔했지 뭐야. 그렇지만 평소처럼 익숙해진 표정 뒤에 숨어 아무렇지 않은 척 너의 어깨를 톡 치면서 대답할게. 너의 승낙에 나는 끈 풀린 풍선처럼 동동 떠버린 마음을 안고 친구처럼 환하게 웃어보일거야.
“통했네! 뭐 먹을지 기대된다.”
너의 자리에 놓인 투명한 물병에 햇빛이 부딪혀 무지개로 흩어지는 모습에 잠시 눈을 빼앗겼어. 항상 내리쬐는 햇빛인데 저 작은 변주를 통해 늘 반짝거리는게, 마치 너 같아서. 사실 날씨 같은거보다 너의 그 미소가 훨씬 중요한데.
“그러게. 다행이다. 나, 어제 새로 산 흰색 운동화 신었거든. 비 오면 끝이야.”
키득키득거리면서 너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전해. 오늘도 내일도 그럴거야. 반짝거리는 햇살도 유리병 너머로 비춰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듯, 우리의 감정도 전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를테니까. 하얀 햇빛 속에 꽁꽁 숨겨 놓을게.
빨리 가고 싶은데, 너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긴걸까? 하루 종일 종례만을 기다리다가 속이 타버릴 것 같아. 동동 발을 굴러봐도,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만을 바라봐도, 어떻게 이렇게 느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최대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머리카락만 빙글빙글 손끝에 감으면서 하교종을 기다리는 건 제법 힘들더라. -
376 이름 없음 (2211926E+5) 2018. 9. 20. 오후 9:00:01끌올!
-
377 이름 없음 (2211926E+5) 2018. 9. 20. 오후 9:00:18ㅇ
-
378 이름 없음 (3585166E+6) 2018. 9. 23. 오전 1:52:51근미래- 과학이 발전하고 마법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 그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 사람들 역시 변하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예 인간의 모습을 벗은 이들도 생겨났다. 소위 이종족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종족들의 모습은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별나고 이질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 역시 그러했다. 지성을 가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이 차츰 나오기 시작한 탓이었다.
하지만 이종족은 이종족이었고, 이레귤러는 이레귤러였다.
그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진 직후에는 괜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로 인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존의 인간과 다른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그저 묵과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이종족에게 대항하기 위한 전담 팀이 생겼다. 그렇게 그들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듯 했다.
그러한 나날 중에 한 사건이 세간에 화재로 떠올랐다. 다수의 시민이 도시 곳곳에서 무차별 흡혈을 당해 최소 중상이거나 사망하기까지 이르는 사건이었다. 흡혈을 하는 종족에게는 돈 주고 혈액을 살 수 있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흡혈을 하는 것은 범죄였다. 하지만 흡혈할 때 특유의 쾌감과 황홀함을 즐기는 이들은 종종 그런 범죄를 저지르곤 했다. 이런 류의 범죄는 시간을 길게 끌수록 희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면 그럴수록 담당자들을 놀리듯 희생자는 늘어만 갔다.
나날이 새로운 희생자가 신문 1면을 장식하던 어느 날. 그 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다. 우산을 써도 좀처럼 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내리는 그 날에 한 골목에서 한 남자가 새하얀 머리칼을 가진 여성에게 붙잡혀 있었다.
"이런 비가 내리는 날은 정말 좋아. 비가 핏자국도 피냄새도 모두 지워주거든."
은빛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여성은 20대로 보이는 외모였지만 풍기는 기운이 남달랐다. 짙은 금빛 눈의 세로 동공을 가늘게 좁힌 여성은 비에 몸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잡은 남자의 어깨를 바스라뜨릴 듯 쥐었다. 남자가 아파하며 비명을 질러도 빗소리가 그 비명을 가려주었다. 무의미한 저항을 하는 남자를 보며 여성..뱀파이어가 말했다.
"요즘 너무 날뛰었나보더라고. 다들 이런 날은 안 나오더라? 캬하하. 그런데 어떤 멍청이가 나한테 잡.혀.버.렸.네? 아, 정말 고마워!"
방금 전까지 남자를 으스러버릴 듯 하던 뱀파이어가 활짝 웃더니 대뜸 남자를 품에 끌어안았다. 자신보다 체형이 큰 남자였음에도 뱀파이어는 마치 장난감 다루듯 이리저리 휘둘렀다. 그러다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덕분에 오늘밤도 배부르게 잘 수 있겠는 걸. 그래. 고마우니까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 들어줄까? 뭐든 말해봐? 살려달라는 것만 빼-고?"
뱀파이어 여성은 아주 자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여성은 남자를 놔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비에 젖어 얇은 옷 아래의 매혹적인 굴곡이 다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으며 여성은 남자를 보고 있었다. 뭐든 말하라는 것처럼.
//근미래적인 분위기에 인간과 이종족들이 공존하는 가상의 도시라는 배경으로 범죄자 뱀파이어와 느와르 썸씽 좀 타볼 사람 있을려...나...? -
379 이름 없음 (8609834E+5) 2018. 9. 25. 오전 12:17:18>>378
마법의 출현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와 별개로 힘의 이상을 맹신하며 마법을 만능책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생겨났다. 힘을 향한 집착은 어린 집단인 10대에서 유독 두드러졌고 교내의 풍조 또한 기형적으로 가속하며 이능력자를 필두로 교내에 세력이 세워진다거나 하는, 구시대의 일진과 같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개인은 일개 짐승과 다르지 않았고 곧은 힘의 원리가 곧 정의를 일컷는 의미로 작용했다.
그런 시대를 이레귤러가 아닌 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힘의 원리에 순복한다는 의미만을 가졌다. 그래... 나는 짐승인채로 자라나, 꿈을 거세당한채로 살아왔다. 어제까지는 말이지.
이레귤러가 자주 나타난다는 구 번화가는 너무 많은 범죄가 발생했기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반쯤 금지구역 취급을 받으며 꺼리는 곳이 되어갔다. 그리고 최근 버려진 번화가의 골목에서 피가 말라 죽은 시체들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돌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이레귤러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일반사람들은 더욱 그 거리를 꺼리기 시작했으며 그곳은 암묵적으로 죽은 거리가 되어 인적조차 드문 범죄에 최적화된 장소가 되어갔다. 때문에 간혹 무모한 바보들이 자살이라도 하기 위해 이 장소를 찾아오고는 했지만...
나는 사실 알거든. 이레귤러에게 죽느니 곱게 추락해 죽는게 훨씬 편안한 죽음이 되리라는걸. 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학창시절의 악몽을 되새기며 거리를 찾았다. 그럼 무모한 자살희망자가 아니겠냐 묻겠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더 큰 고통과 마주하려 하겠어? 그녀석들은 현실도 마주보지 못한 새끼들이야. 나는...
은발의 미인을 내려다보며 애써 쾌재를 지르는 표정을 당혹감 뒤에 감춘다. 이상적인 외모에 감춰진 광기가 금안 너머로까지 느껴졌으나,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강한 분노에 이성이 잠식된 것인지, 공포로 판단이 마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신은 언제고 시련이랍시며 악마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곤 했고, 내게는 그보다 강한 존재가 필요했다. 악 조차 삼킬 강대한 괴물이.
"더... 원하지 않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요..."
내게는 이레귤러 동창이 하나 있다.
"이 번화가에선 금방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실거에요. 이미 신문에 알려졌고, 겁 많은 사람들은 조심성이 강하니까요. 만약 직접 찾아가신다면 그들은 도망치지 못하겠지만... 일반 주택가는 이레귤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아요. 겁쟁이들은 잘 숨어들잖아요."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직장에 찾아와 진상을 부린 통에 더는 다닐 수 없게 만들었던 오랜 악마가 있다. 하지만 일반경찰은 이레귤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특별반이 아니라면 경미한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어떤 이레귤러는 특출난 능력으로 공무원 등의 직업에 임하며 그 위치를 공고히 하며 살고 있었다. 이레귤러의 대항자는 이레귤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필요악이 되고는 했다. 내 동창 역시도 졸업 후 자연스럽게 그런 루트를 타며, 특권층으로 자리매김 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 모든걸 바칠테니 제발..."
내 동창은 우습게도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주택가의 안전을 맡고 있다.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식으로나마 살아남길 원한다. 때문에 녀석은 내 모든걸 알고 있었지만... 그건 반대로 나와 일반 시민의 안전이 그 녀석의 밥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 새끼의 모든걸 빼앗고 부숴버리거나 하다못해...
"아니면 차라리... 저를 가장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나만이라도 무참히 살해당해 그 녀석의 경력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
380 이름 없음 (8609834E+5) 2018. 9. 25. 오전 12:38:26>>379 너무 늦게 달았나... 썸씽은 어떨지 모르지만 소재가 재밌어서 달았어
-
381 이름 없음 (8301261E+5) 2018. 9. 25. 오전 1:56:07>>380 자기 전에 들렀더니 이렇게 반가울수가! 하지만 졸려서 잇는 건 무리일듯ㅠㅠ 괜찮다면 자고 인나서 답레 가져올게!
-
382 이름 없음 (050527E+56) 2018. 9. 25. 오후 7:03:07" 자, 선택해. "
위태롭게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느릿히 점멸했다. 회색빛 벽으로 둘러쌓인 방과, 이상하리만치 위화감이 드는 무거운 공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두 사람.
먼저 입을 연 건, 붉은 머리칼을 하나로 내려묶은 여자였다. 단정히 차려입은 검은 정장과 그 위로 흩뿌려진 핏자국의 절묘한 조화가 이유 모를 기시감을 피워내고 그녀의 입에서는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ㅡ그래, 분명 그녀의 핏자국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꽤나 지친듯 느릿히 감겨내리는 눈꺼풀 아래로 여린 손에 쥐어진 권총이 전등에 비추어져 옅게 빛을 낼 뿐이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였던가.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맞았던가. 흐릿하게 번진 기억 사이로 떠오르는 얼굴과 제 눈 앞에 놓인 그 얼굴이 겹쳐져 기괴한 화음을 쌓아내리고 있었다. 낡은 필름을 상영기에 끼워넣어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그 기억 속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 네가 나를 쏜다면, 적어도 의심 받는 일은 없을거야. 오히려 네게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지. 거대 범죄 조직의 수뇌부 중 하나를 죽였으니. 너와 네가 사랑하던 사이란 것도 들키지 않을거야. 너를 더러운 범죄 조직의 첩자로 의심하는 눈초리도 사라질테지. "
미안해, 애초에 너를 만나선 안됐었어. 모든 건 내 손에서 시작된거야. 그녀가 낮게 읊조렸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무거운 공기에 눌려 내려앉고 말았다. 그녀는 내리깔았던 눈동자를 다시금 움직여 당신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팔을 들어 당신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오른손에 쥐어진 총은 시멘트가 발려진 바닥을 긁어내더니 이내 당신의 왼손에게로 넘겨졌다. 왼손은 천천히 당신의 뺨을 향해 흘러내리고 다시금 자유로워진 오른손은 그 반대편의 뺨을 어루어만지며 조용히 당신을 어루어만진다. 그녀의 눈망울이 부드럽게 젖어 당신을 담아내고 있었으나, 당신은 그걸 알지 못했겠지. 한참 당신의 얼굴을 어루어만지던 그녀는 두 손을 떼내어 제 무릎 위로 가지런히 모아내었다. 짙은 고동색의 눈동자는 여전히, 당신을 바라본 채로.
" 미안해. 네게 이런 선택을 남겨둬서.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감히, 너를 사랑하고 싶어했기에 이렇게 되어버린거야.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녀의 눈꺼풀이 부드럽게 말려내려갔다. 더이상 그녀는 어떠한 말도 내뱉지 않고 천천히 두 눈을 감아내렸다. 사실 속으로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외칠 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얼굴은 오로지 자신의 죽음만을 외치고 있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무채색의, 어떠한 감정도 묻어나지 않은. 감정을 집어 삼키는 고요한 정적이었다.
# 구레딕 상라판에 있었던 짝수는 경찰, 홀수는 마피아가 되어보자! 스레가 문득 생각나서 아무렇게나 적어본다! 마피아의 수뇌부인 a와 경찰인 b의 새드엔딩 로맨스를 한 번 해보고 싶었어 :3 -
383 이름 없음 (8301261E+5) 2018. 9. 25. 오후 8:45:59>>379
비는 한결같이 세차게 쏟아지며 바닥을 흘렀다. 여성도 남자도 전부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물에는 아직 핏빛이 섞이지 않았다. 자비 아닌 자비로 그에게 소원 하나를 말한 탓에 기묘한 대치가 이어지는 중인지라. 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분위기는 언제라도 남자의 목에서 핏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뱀파이어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마지막 소원 하나. 그 말에 남자는 이상한 제안을 했다. 더 원하지 않느냐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뱀파이어는 그저 활짝 웃는 얼굴로 남자의 눈을 응시했다. 바늘처럼 가늘어진 동공이 마치 찌르는 것처럼 남자를 주시한다. 하얀 얼굴에 빗물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굳은 듯 서서 그를 보던 여성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천둥이 울려퍼져 웃음소리를 지웠다. 노린 걸까. 의도한 것일까. 길고 길었던 천둥소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날카롭고 카랑카랑하게 웃은 여성은 다시 빗소리만 들리게 되어서야 대꾸했다. 명백히 웃음기가 남은 목소리가 세상 무엇보다 고혹적이고 유혹적으로 울렸음은 달리 말할 것도 없으리라.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어? 저런저런. 이래서 인간은 안 된다니까. 생각이 너~~무 짧아! 바보들이야! 지들이 뭐든 아는 것처럼 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다니까!"
여과 없이 툭툭 나오는 말들은 흡사 화난 것 같았으나 흰 얼굴은 여전히 웃음기가 어려있고 목소리 역시 변함없다. 참을 수가 없어 정말! 소리 높여 내지른 여성이 돌연 입을 벌렸다. 붉고 도톰한 입술이 벌어지자 그 사이로 보이는 것은 새하얗게 빛나는 긴 송곳니. 역시나 붉은 혀로 날카로운 송곳니를 한번 핥더니 그대로 남자의 팔뚝을 깨물었다. 옷 정도는 가볍게 꿰뚫은 송곳니가 살갗을 뚫는 것 역시 간단했다. 일순간에 몰려오는 고통에 남자가 비명을 터뜨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성은 한모금 정도 피를 빨아들인 후 이를 빼고 고개를 젖혔다. 새어나온 피가 입가를 붉게 적시고 흡혈로 인한 쾌락이 흰 얼굴에 홍조를 불러 일으켰다. 하아- 피내음 짙은 한숨을 내쉰 뱀파이어가 황금의 눈동자를 데굴 굴려서 조금은 두려워졌을지도 모르는 남자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말이지...아직도 이 세상이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방비하게 나다니는 인간들을 잡아먹는게 좋은 거야. 분명히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험성이 다분한 곳을 멍청하고 멍청하게 싸돌아다니는 인간들이야말로 최상의 비명을 질러주거든! 자신의 믿음이 깨졌을 때의 절망과 낯선 것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눈을 끝까지 마주하면서 고통을 주고 그 피를 남김없이 빨아들일 때야 비로소 극상이지! 요즘은 돌아다니는 인간이 줄긴 했지만 상관없어. 인간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지독하니까. 내게 필요한 건 오로지 최고의 디너를 위한 공복 뿐이라고."
훅- 숨을 불자 혈향이 뒤섞인 숨결이 남자의 코끝을 간질이고 곧 흩어진다. 키히힛. 듣는 것 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을 흘린 뱀파이어는 날카로운 손톱이 가지런한 두 손으로 그의 턱을 잡고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젖혔다. 하지만 물지는 않고 조금 더 재잘거렸다.
"너의 모든 것 따위는 관심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돕는다는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흐히. 어차피 저물지 않는 삶이야. 비렁뱅이의 소원 하나쯤 들어준다고 덧날 일도 없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경쾌한 말과 함께 하얀 손이 그를 골목의 벽으로 내팽개친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한번 스윽 쓸어올린 뱀파이어가 손을 내밀며 손끝을 까딱였다.
"나를 한시도 지루하게 만들지 마. 그것이 내가 거는 조건이고 너는 항상 명심해야 할 거야. 지루함의 대가는 네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으로 받아갈테니까." -
384 이름 없음 (6418475E+6) 2018. 9. 26. 오후 7:58:37>>383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절반밖에 못 썼어ㅠ 내일 올릴게...
-
385 이름 없음 (4843054E+5) 2018. 9. 27. 오전 3:20:12>>384 아 괜찮아 괜찮아! 이어주는 거만으로도 고맙지 나야ㅋㅋ기다릴테니 언제든 올려줘!
-
386 이름 없음 (5193896E+5) 2018. 9. 28. 오전 1:01:07속절없이 쏟아지는 비로 양 어깨가 젖어버린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었다. 죽은 거리에는 흔한 조명 하나 없었기에 비의 흔적을 찾는 일 역시 오직 소리의 역할이었다. 골목의 아스팔트 바닥이 세차게 울리며 비의 속도를 억지로 체감시켰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고라도 내리는 사신처럼 빗소리는 되려 요란스레 고독을 알렸고, 이 이상 몸이 차가워질수 없을 쯤 저편에서 빛이 크게 일어났다. 순간적인 빛에 흰 얼굴에 빛났고 고혹적인 미소 뒤로 음산한 기운이 스쳤다.
직후, 큰 천둥이 악마의 웃음처럼 몰아치며 한참을 울려댔다. 그녀의 웃음과 천둥소리가 엇갈리며 쟁쟁한 소리가이 귓가에 멤돌고, 다시금 미인은 어둠이 물든 흰 얼굴 너머로 은근한 혐오가 묻어나는 말을 던져댔다. 체온을 잊은 감각 뒤로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분명 살해당할 것이라고, 이로써 이 지옥과도 영원한 이별이라고. 희게 질려버린 입술 위로는 어느샌가 이유 모를 실소가 새어나왔다. 오랜 비에도 색이 질리지 않은 붉은 입술이 작게 벌어지며 송곳니를 드러낸다. 죽는다는 확신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양 눈이 감기며 미간이 일그러졌다. 한심하게도...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허무감과 회한이 교차하는 얼굴은 마치 죽음을 앞둔 노인처럼 평온하기도 허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말의 통증, 오직 상기된 미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기에 나는 겨우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윽... 어째서...?"
추위로 체온이 시체만큼 낮아져 감각이 무뎌졌으나 팔에서 흐르는 피의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혼란스러운 눈동자로 그녀를 좇자, 어둠속에서 더욱 빛나는 흰 피부는 이질적이게도 고혹스럽게 다가왔다. 싸늘한 눈동자는 노기가 명백했음에도 이어지는 말소리는 마치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듯 했다. 맹수의 흥미를 끌어버린 사냥감에게 그 존엄함을 알리는 울음소리처럼. 나는 그 흥미가 날 구원하길 바라며 숨을 죽였다.
말이 멈추고 고고하게 빛나는 흰 손이 턱을 젖혔다. 막 들이켰을 피냄새가 코끝에 끼치니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경직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자 흰 피부는 어둠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그 미모에 멈칫 넋을 잃자, 직후 자신은 이내 벽으로 내팽개쳐지고 거만하게 내려보는 미소가 보인다.
"저... 정말. 정말로..."
어둠속에서 조차 고고하게 빛나는 그녀의 손 끝을 성급히 잡으며 혼란스러운 눈동자로 붉은 눈을 올려다봤다. 흥미로 가득 찬 표정은 장난기 동한 아이 마냥 순수해서 이레귤러 특유의 광기를 느꼈다. 다만 한편으로 저런 흥미만이 이레귤러의 진심일 수 있지 않을까. 저 강하고 자기중심적 존재를 다룰 수 있는건 오직 이레귤러 뿐일테니까. 순간 감격에 겨워 나오려던 눈물을 억누르고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추위에 지쳐 저도 모르게 숙여지는 몸을 그대로 떨구며 손끝으로 아스라질듯한 흰 손을 놓지 못했다. 놓으면 이 기적같은 구원자가 꿈처럼 사라질것 같았다. 올려다보니 그 달빛과 같은 금안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어 흡사 여신이나 신의 부름을 받드는 것 같았다. 실상은 달랐음에도. 혹여 사라질까 급하게 붙잡는 목소리로 말을 읊어갔다. 긴장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
"D구역의 A상가... 그 지역이 가장 최초로 지정된 보호구역이었죠. 이레귤러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로 위장해 둔. 이제는 방치되어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지만... 사실 마약중독자 소굴이죠..."
최초의 보호구역이란 명성과 다르게 시설이 노후하고 이레귤러의 눈을 속이는데 집중해 개인의 편의는 등한시된지라, 지금은 많은 이들이 꺼리는 비밀 주택가였다. 그 버려진 주택가의 남은 목적은 이상한 쪽으로 빛을 발했는데 암거래상들의 거래장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레귤러의 출현으로 사회의 암묵적인 계급구조가 기운것은 둘째로, 이종족 특유의 광기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며 일반적인 인간들은 심리적인 질병을 하나둘씩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를 잘 이용해낸것이 마약상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적으로도 내몰려 있기 마련이라. 약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이죠. 그렇게 가난해서였든, 중독자였건 내일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단순하고 폭력적이 되죠. 무방비한 인간들이라면 모두 모여있다 장담할 수 있을만큼..."
한편으로는 경찰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숨겨진 마약 조직은 비단 D구역의 사람들만이 아닌 타 구역의 인간들에게도 큰 유혹으로 다가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중독자들이 벌이는 충동적 범죄들은 충분히 문제시되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간에는 알리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암부 조직이 알려진 바 보다 크다면 경찰이 방임한 책임이 될 테니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니 제일 처음 사건을 터트린다면 그곳이어야 한다. 가장 감추고 싶어한 곳에서 감출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
387 이름 없음 (5193896E+5) 2018. 9. 28. 오전 1:02:27>>386 >>383 이걸 빼먹었다...
-
388 이름 없음 (4532619E+6) 2018. 9. 28. 오전 3:24:59>>386
이 거리에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던 존재는 그에게 같은 죽음을 주지 않았다. 그의 숨을 앗아 미쳐버린 세상에서 구원해주는게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건만. 냉혹한 금의 눈동자를 가진 뱀파이어는 한때의 유희를 위해 한 남자의 인생을 거머쥐었다. 시리도록 새햐안 손끝으로 건져내듯 쥐고서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조각상 같은 얼굴에 번진 웃음은 그야말로 악마의 미소였다.
여성은 자신이 잡은 손이 어떤 손인지도 모르는 채 매달리는 남자를 가볍게 끌어당겨 팔을 붙들었다. 조심성이나 상냥함 따위는 지금 내리는 빗물 한방울만큼도 없는 동작이었으나 추위에 무너지는 그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데는 충분했다. 남자보다 가늘고 희디 흰 팔과 가는 손가락으로 옷을 움켜쥐고 팔을 잡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받쳐들고서 떨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살짝 눈을 내리깔고 상체를 기울여 그를 향한 여성의 모습은 그저 조금 신비로울 뿐인 뭇 인간과 다를 바 없어보였다. 방금 전까지의 모습을 보지 못 한 사람이라면 그녀를 이레귤러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차분하고 잠잠해져 있었다. 그러나 하얀 속눈썹 아래 반쯤 감춰진 눈동자 속엔 여전히 바닥 모를 광기가 맴돌았다.
D구역의 A상가, 마약중독자의 소굴, 그러한 내용에서 자연히 암시되는 약의 거래처, 그늘 속 조직. 남자가 드문드문 한 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유추해내는 것은 여성에게 어렵지 않았다. 그 말들이 가리키는 목적 역시. 단순하고 단순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아하. 곱게 다물려 있던 입술을 벌려 알았다는 듯한 소리를 흘린 여성은 그대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가장 더럽고 추잡한 밑바닥에서부터 크게 한탕 벌려달라는 것인가. 야하. 역시 인간의 생각이란 거기서 거기야. 겉으론 아무리 깨끗한 척 하고 고결한 듯 굴지만 한겹만 벗기면 누가 다를 것 없이 새까맣고 추하지. 전부 똑같아. 너 역시 그렇지. 그래.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모두와 똑같은 얼굴을 하느라 지쳤지?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지내는 삶은 매일매일 조여드는 목줄을 메고 사는 것처럼 끔찍했을거야. 오,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 여기로 와 날 만난게 과연 그 삶에 구원이 될까?"
구원이 될까, 라는 말과 함께 하얀 손가락이 남자의 목덜미를 훑어올리고 턱을 들어올렸다. 뱀파이어에게는 한없이 여린 목을 젖혀질 수 있는대까지 젖히고 넋 나간 눈동자에 자신의 금빛 시선을 맞추었다. 여성의 뒤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검은 구름이 드문드문 걸쳐진 밤하늘이 얼핏 보이고 있었다. 그 하늘에는 여성의 눈처럼 밝고 살갗처럼 흰 보름달이 떠 있어 그것이 어두운 골목길의 유일한 조명이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여성과 남자를 비추는 달빛 속에서 뱀파이어는 그와 거리를 좁히며 실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흘렸다.
"내가 네게 구원이 될지 또다른 저주가 될지는 네가 정할 일이지. 알아서 정해. 원하는대로, 소원하는대로. 모든 것의 결과가 결국 너를 더 큰 파멸의 나락으로 끌고간다 할지언정 네가 그것을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그리 될 테니. 자. 나는 네 바람을 받들어 가장 화려한 시작을 선보여줄 것이야. 너조차도 눈을 돌리고 끔찍하다 생각할 정도로 유열에 물든 핏빛 전시회를 거리에 펼쳐 줄 테니."
여성의 입술 사이로 다시 흰 빛이 반짝였다. 이질적으로 길게 뻗은 송곳니가 차가운 숨을 가르며 드러나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내 배를 채우는 것은 네 피여야만 한다는 걸 새롭게 명심해. 네 속에 쌓인 질척한 욕망이 섞인 피를 즐기고 싶어졌거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송곳니의 끝이 목덜미에 파고들었다. 보호하는 옷감 한겹조차 없는 맨살은 저항도 못 하고 침입자를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었다. 맥이 뛰는 그 자리를 물어 생명의 원천을 빨아들이는 동안 여성의 팔은 몹시도 부드럽게, 감미롭게 그를 품에 끌어안았다. 쾌락을 동반한 행위에 맞춰 차고 푹신한 자신의 팔 안에 안고 젖혀진 그의 뒷목을 받쳐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마치 연인의 그것처럼. -
389 이름 없음 (5193896E+5) 2018. 9. 28. 오후 8:59:10>>388 미안해...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종일 누워있었어ㅠㅠ 2,3일정도 기다려줄수 있을까... 글을 쓸 수 있겠다 할 상황이 아니라서...
-
390 이름 없음 (4532619E+6) 2018. 9. 28. 오후 9:17:53>>389 오 물론 기다릴 수 있지! 며칠이 걸리든 이어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니까. 마음 푹 놓고 건강부터 챙기렴. 레스보다 네 몸이 우선 아니겠니. :)
-
391 이름 없음 (6868545E+6) 2018. 9. 30. 오전 3:10:29ㄱㅅㄱㅅ
-
392 이름 없음 (3145565E+6) 2018. 10. 5. 오전 6:47:51>>390 너무 늦게 달아서 미안해ㅠㅠ 도저히 글을 못 쓰겠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만 쓸게... 짧았지만 즐거웠고 고마웠어ㅠㅠㅠ
-
393 이름 없음 (2771687E+5) 2018. 11. 19. 오후 11:06:57“ 그것 참 흥미로운 얘기군요.”
커다란 눈처럼 보이는 푸른 공작 깃이 달린 매우 큰,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부채를 나는 지루하게 두어번 흔들어댔다. 무료한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아가며 지겨운 화젯거리에 흥미가 있는척 귀를 기울여가는 나는 또 얼마나 우스운가. 코르셋은 느슨히 했음에도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고, 그것이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삼삼오오 모여든 부인들은 내 허리에 눈길을 주며 미묘한 웃음을 흘려댔다. 그녀들에게 그래 그렇게 죽도록 허리를 조여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해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자 아양떨며, 부풀린 드레스를 흔들어대고 또 들이대니 즐겁냐고 소라를 지르려던 내 입에서는
“ 흐응, 정말 아름다운 진주로군요.”
정도의 몹쓸 가식을 떨 뿐이였다. 그야 뭘 어쩌겠어. 눈 밖에 났다간 안그래도 어려운 내 삶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 가늠도 안 되는 걸. 그놈의 교양, 파티, 케이크.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병에 걸려 돌아가시지만 않으셨다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을테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속임이 필요했다. 난 비록 부모가 없어도 아직 잘 지낸다도. 너희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만큼 궁핍하지 않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드레스도 마련해 왔건만 높은 하이힐와 코르셋보다도 조여오는 눈길에 정신은 점점 아득해져 갈 뿐이다.
“ 아아.”
자겨워. 은근히 뒤로 물러선 나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잠시 쉬기 위해 어두운 복도로 나와 기대선채 눈을 감았다.향수로 피로해진 내 코와 샹들리에로 고통받는 내 눈과, 오늘 파티의 주인공이신 헬레자이드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여기에선 그 누구도 날 조롱할 사람이 없겠지. -
394 이름 없음 (7332382E+5) 2018. 12. 6. 오후 8:12:46막 잎을 틔우려던 새싹이 얼어죽고, 미처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가 맥 없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꽃봉오리 역시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씨앗과 꽃을 보살피는 요정들이 하루에도 열두 번을 넘게 찾아와 고개를 숙여가며 이야기했다.
방금 찾아온 벚꽃이 엎드려 '이러다가 정말로 다 죽어요!' 하고선 거의 울다시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 그래도 춥다 춥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나.
턱을 괴고 있던 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내가 가볼게. 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시무룩한 것 같기도 했다.
바람을 따라 걷다보니 겨울의 궁 앞이었다. 원래 이맘때쯤에는 봄의 궁이 되어 갖가지 꽃들이 가득 피어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소복히 쌓인 눈과 메마른 나무가지만이 보였다. 조심스레 궁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앞에 섰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겨울은 그 안에 있었다. 처음 찾아왔던 것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들어가 겨울의 앞에 앉았다.
"잘 있었어요, 내 사랑?"
/ 봄을 관장하는 신이랑 겨울을 관장하는 신의 이야기야! 둘은 연인이고 각자 바쁜 봄과 겨울에는 만나지 못한다는 설정 ㅠㅠ...! 헤어지기 싫은 두 사람입니닷 -
395 이름 없음 (7794811E+6) 2018. 12. 8. 오후 5:42:22>>394
코끝을 차갑게 얼리는 바람이 궁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맘때면 차가운 동풍은 물러나고 봄내음이 적절히 궁 안에서 풍겨야 할 일이건만, 어째서인지 아직까지도 적막과 추위, 오직 그것들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겨울의 궁전이었다. 푸른 바람과 얼어붙은 공기가 춤을 추는 그 곳. 문지기처럼 든든히 궁전의 입구를 지키는 고드름과 살을 에는 추위를 제치고 도착한 궁의 중심부에는, 서리가 뽀얗게 내린 왕좌에 앉은 겨울이 막 잠에서 깨어나 졸린 눈을 비비고 있을 뿐이었다.
" ㅡ아, 내 사랑. 보고 싶었어요. "
희멀건 안개가 끼어있던 시야가 이내 명확해지고, 제 시선에 걸린 봄을 보며 겨울이 말갛게 미소를 지어올렸다. 겨울은 나직히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품을 삼켜내고는 조심스레 왕좌에서 다리를 뻗어냈다. 겨울이 왕좌에서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자 맨살과 대리석이 맞닿아 진득이는 마찰음을 빚어낸다. 그러게 몇 걸음이나 지났을까, 결국에 봄과 그 숨결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진 겨울이 손수 저를 만나러 온 봄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보드라운 눈덩이같은 포근한 손길이 겨울을 녹이는 봄의 얼굴에 닿아 미끄러진다. 겨울은 큼,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를 억지로 끄집어올려 밝게 대꾸했다.
" 어쩐 일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 "
말갛게 피어오른 미소 뒤로, 다시금 보고 싶었다는 단어를 흘리며 겨울이 부드럽게 손을 내려 봄의 오른손을 꼭 잡아쥐었다. 차갑고 황량함이 가득하던 눈동자에 봄이 피어올랐다. 봄이 찾아온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히 웃으며 봄과 맞잡은 겨울의 손에 약하게 힘이 들어간다. -
396 이름 없음 (9772139E+5) 2018. 12. 8. 오후 7:42:17>>395
겨울의 미소을 보며 함께 웃음을 지었다. 추운 나날 동안 만나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길고 길었던가. 매서운 추위에 밖으로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워 자신의 궁에 박혀 있기만 하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겨울의 기세가 약해져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 뺨에 닿는 손길에 부드럽게 눈 감으며 웃어보이면서도, 슬픈 기색이 떠오르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제 당신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차가운 바람을 거두어 여린 잎들이 새로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다정한 말에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 당신은 왜 이다지도 따뜻한 겨울이어서.
"보고싶어서 왔어요. 우리 너무 오래 만나지 못했잖아요."
봄이 겨울이 잡은 손 위에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다. 함께 있던 여름과 가을은 꿈만 같아요. 그 두 계절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것만 같은데, 당신의 겨울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 짧은 나의 봄도 내게는 길게만 느껴지겠죠. 당신을 만날 수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이 내리는 눈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나요?"
그 아름다운 눈송이를 내리는 당신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본 어떤 꽃보다도 당신이 아름다워요. 말로 뱉기에는 부끄러워 나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지만. 겨울의 손 위에 얹어놓은 제 손을 꼭 쥐었다. 정말이지, 그와 조금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다. -
397 이름 없음 (3459669E+5) 2018. 12. 9. 오전 12:17:00>>396
그리도 연약하고 가녀리던 당신이 어찌 이 추위를 뚫고왔을까. 겨울의 손이 차갑게 식어버린 봄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겨울의 기세를 누그려 당신이 오는 길을 녹여둘걸. 겨울이 작게 숨을 내뱉으며 생각했다. 겨울의 눈꺼풀이 느슨히 감겼다 떠오른다. 봄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어렴풋이 예감했음에도, 차마 그 어여쁜 얼굴에 핀 슬픔이 퍼져나가는 게 싫어서, 겨울이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 너무도 오래 만나지 못해서, 당신이 나를 잊을까 무서울 정도였지요. "
겨울의 눈동자가 봄의 눈동자와 마주했다. 이내 차가운 제 손 위로 봄의 손이 포개어지자 소중한 물건을 감싸쥐듯 더욱 부드럽게 봄의 손을 쥐는 겨울이었다. 혹여라도 금방 녹아내릴까, 아니면 금방 얼어붙을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겨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올랐다. 포근한 눈송이와 같은 미소였다.
"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
따스한 그 말에 겨울이 놀란듯 제 눈을 두어번 깜빡이더니 이내 다시금 말갛게 미소를 지어올리는 겨울이었다. 늘상 꿈꾸는 일이었잖아요. 언젠가 당신이 피어올릴 아름다운 꽃송이를 위해 져버릴 겨울이었다. 당신이 아름답게 만연한 그 계절의 꽃보다도 아름다울 게 있을까. 봄의 말에 겨울이 맞잡은 손을 풀어 봄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혹여라도 당신이 아파할까 참으로 세심한 손길로 봄을 끌어 안는 겨울이었다. 제 품에서 안에서 피어오른 봄을 따스하게 품어내며, 겨울이 봄의 귓가에 나지막한 말소리를 옮겼다.
" 당신이 원한다면, 내 모든 걸 줄게요. 눈송이도, 겨울의 풍경도, 그 무엇도. "
그토록이나 바라던 당신이기에. 겨울이 느릿히 눈꺼풀을 감아내렸다. -
398 이름 없음 (3116455E+6) 2018. 12. 9. 오전 12:50:29>>397
내가 어찌 당신을 잊나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내가 봄임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걸요. 겨울의 끝자락이라도 쥐었다가 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록 당신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기나긴 당신의 계절에는 차디찬 바람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당신을 닮은 어여쁜 눈송이들을 보면 다시금 웃으며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은 꽃들을 보며 나를 떠올려줄까요? 노란빛 분홍빛 어여쁜 꽃잎들이 화사하기 피어나는 순간마다, 온화한 바람이 불어 뺨을 간질일 때마다 내가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이 좋은 걸요. 이미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걸요.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잊는 일은 없어요."
보드라운 손길로 제 손을 맞잡아오는 것은 겨울이라 믿기에는 너무나 따뜻한 손갈이었다. 당신의 다정함을 사랑해요. 아니, 다정한 당신을 사랑해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애 없었겠지만. 겨울의 대답에 봄이 은은하게 미소지으며 겨울을 바라보았다.
결국에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다. 그토록 바라던 연인과도 만났고, 그의 품에 안겨있기까지 했으니까. 나를 이토록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당신이 가끔은 내게 과분한 이 같아서 두려워요. 봄이 팔을 뻗어 자신을 안은 겨울을 끌어안았다.
귓가에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에 작게 한숨을 쉰 봄이 눈을 꼭 감았다. 정말로,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만 커져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인 걸요. 나는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쿵쿵대는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힌 봄이 겨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다 줄게요. 따뜻한 바람도, 어여쁜 꽃들도 전부요. ...그치만 나를 가장 예뻐해줘요. 그것들을 더 예뻐하면 질투할지도 몰라요."
망설이던 말을 덧붙인 봄이 겨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
399 이름 없음 (3459669E+5) 2018. 12. 9. 오전 1:54:14>>398
황폐한 겨울 끝자락에 새싹을 피워낸 봄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 나의 겨울이 끝나고 당신의 봄이 찾아오면 내 얼굴에도 피어오르는 그 보드라운 미소를 당신이 알까. 비록 당신이 오면 나는 녹아내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사랑스럽기에 내 기꺼이 녹고 말아야지.
" 고마워요. 나 또한,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 "
겨울이 어찌 봄을 잊을까. 죽음이 어찌 생명을 잊을까. 저와는 다르게 밝게 빛나는 생명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자연의 섭리와 같은 당연한 이끌림이었을 것이다. 본디 모든 생명체는 따스한 생명의 태동을 사랑하는 법이었으니. 나 또한 나의 주제를 아주 잘 알기에 겨울의 끝자락에서 당신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거늘, 어찌하여 당신은 그 가녀린 생명을 품고 추위 속으로 뛰어들었나. 어찌하여 내게 뛰어들었나.
" 행복해지는 말이네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니. 늘 바라던 일이었는데. "
겨울이 부드럽게 대꾸했다. 따스한 숨결이 닿아 이내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녹아내려 사라질 것만 같았음에도 이 순간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속도 없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을 닮은 목소리였다.
" 괜한 걱정이네요. 내가 당신보다 아낄 게 무엇 있다고. "
그러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봄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는 겨울이었다. 생명의 부드러움이 제 어깨에서 요동친다. 봄의 숨결로 하여금 겨울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만다. 언젠가 파도로 변할 그 마음이 혹여나 들켜버릴까. 겨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손길을 멈추고 봄을 더욱이 포근히 끌어안았다.
"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모처럼 만난 우리인데, 그 시간들을 즐겨야죠.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보고 싶은 건?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까. 어서 내게 말해봐요. "
겨울이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며 입을 열었다. 창밖에는 모처럼 누그러진 날씨 사이로 포근한 눈송이가 내렸다. 제게로 봄이 다가왔음이 느껴졌다. -
400 이름 없음 (9574735E+5) 2018. 12. 9. 오후 6:26:41>>399
어리광 같은 말에도 따뜻한 대답이 돌아오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해준 말은 생각보다 더 다정한 말이라서. 저도 모르게 피워낸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양뺨이 달아오르는 것도 감추지 않은 채로 웃었다.
당신이 정말 좋아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차오르다 못해 넘쳐 흐르고, 나는 그 안에 잠겨 있는 것만 같아요. 가득 차오른 것에 잠겨 있으니 숨이 막힐 법도 한데 우습게도 나는 그 안에서만 편히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그래요.
겨울을 누가 죽음의 계절이라 하던가요? 봄에 싹을 틔우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덮어준 눈 아래서 포근히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그뿐인가요. 당신의 손길은 나도 살게 하는 걸요. 겨울의 품에 묻고 있던 고개를 든 봄이 다시금 활짝 웃었다.
"아, 시간......."
계속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간에 어리광만 피웠다는 사실에 초조해졌다. 실은 당신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이렇게 마주앉은 채로 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곧 헤어져야 하니.
"함께 나가 산책할까요? 내리는 눈이 예뻐요. ...당신이 손을 잡아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 밖을 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은 봄이 말했다. 겨울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
401 이름 없음 (1930538E+4) 2019. 1. 6. 오후 9:09:43과연 태양신의 사원을 지키는 성기사
말그대로 태양의 조각으로 빚은듯 보였다
피부는 풍요로운 대지처럼 싱그러웠고 그 지평선 너머에서 지는 노을처럼 눈동자는 루비와 호박을 섞은듯 강렬하게 빛을 발산했다
머리에서 이어지는 금으로 된듯한 가닥은 부드럽게 요동치며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하게 모두를 빚추었다
"안녕하십니까 사제..님"
가장 깨끗해야하고 가장 평등해야할 성기사지만 그녀는 자신 한쪽에서 잡아먹을듯 피어오르는 부끄러움에 그만 뒷말이 씁쓸하게 작아지고 만다
그래 인정하자 나는 고위사제인 그를 사랑하게 되버렸다는걸
장미처럼 붉어진 피부색에 그를 바라보는 눈은 아지랑이처럼 초점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녀와 이제껏 함께한 동료들 조차 본적없는 그 표정은 놀림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고 본인도 그것을 알기에 자리를 어서 뜨려한다
"그...그럼 이만!"
/사랑에 빠진 여기사님이라는 설정이야 사제님외에도 동료기사라던가 외부인도 환영이야! -
402 이름 없음 (9554312E+5) 2019. 6. 26. 오전 12:43:15마지막 갱신일이...(흐릿)
이 스레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갱신! -
403 이름 없음 (0975386E+5) 2019. 6. 26. 오전 1:12:03발끝까지 얼어붙을 듯 사무치는 추위가 문 틈 사이로 파고들어 왔고, 형태없이 밖을 두드리는 소음은 어느샌가 있지도 않은 괴담이 되어 인간의 탈을 쓰고, 쥐도 새도 죽은듯이 문을 열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 음산한 추위만큼은 어떤 공포에도 쉽사리 져 떠날 생각을 않는 듯 싶었고, 닫힌 문 너머로도 고요한 존재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 끊임없이 입김이 나오고 손 끝이 시려웠다.
세상은 온통 눈밭이었고 어디까지 흰 빛으로 쌓여 볼 셈인지, 저들끼리 내기라도 나누는 듯 싶었다. 물 끓던 소리가 어느새 수증기로 오르며 음울한 침묵을 끊어냈고, 우려낸 차를 한 모금 입에 담자 체온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겨울의 가난이란 목숨을 담보로 내기를 하는 행위와 같았다. 누구의 총구에서 탄환이 빠져나올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었으나, 필연적으로 죽음은 찾아올 무모한 행동임에 변함은 없었고 안쓰러운 사실은 어떤 가난한 이들도 자신의 총구에는 탄환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누구도 쉽게 잊혀지는 죽음을 바라지는 않았다.
한 모금 넘겼던 차의 온기가 어느샌가 식어버린 듯 싶었다. 미처 온기를 놓칠새라 그는 급작스레 한 모금을 더 들이켰다. 채 식지 않은 온도에 목 끝이 살짝 아려왔다. 어설픈 객기는 항상 아픈 교훈을 가져오기 마련이었다. 흐르지 않은 눈물을 훔치듯이 눈을 두어번 깜박이며 차를 넘겨냈다. 목이 아렸으나 냉기가 가셔 숨 쉬기가 편했다.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표면에는 금새 물기가 맺혔다. 물방울이 탁자의 면면을 적시며 내부의 미묘한 침묵을 깨었고, 그 묘한 규칙성은 바람이 싣고 온 적막감에 빗댈 바 없었다.
사내는 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무로 된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칠은 소릴 냈다.
그는 낡은 총에 총알을 채워넣은 뒤 나무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가려졌던 북풍이 거센 눈보라와 함께 집 안으로 쏟아지려던 것을 사내는 온몸으로 막아내며 집 밖으로 나섰다.
흰 안개 너머로는 숲의 장대함마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이로 누런 안광이 반짝였다 사라진다. 늑대다.
//사내와 싸워줄 늑대를 찾고있어... -
404 이름 없음 (4032882E+5) 2019. 6. 27. 오전 2:12:34>>403
혹독한 겨울이다. 계속해서 내리는 눈은 작은 흔적마저 모두 묻어버리고 매서운 바람은 냄새 한 톨 남기지 않았다. 어제만 해도 둘이 죽었다. 하나는 어렸고 하나는 다리를 절었다. 하늘은 이 땅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만 같다.
며칠째 번번히 허탕만 쳤다. 애초에 살아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질 않았다.
운 좋게 무언갈 마주치는 날에도 사냥에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먹잇감을 낚아채던 속도와 한 번에 물어죽일 만큼의 강한 힘, 지금은 모두 발휘하기 어려웠다.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다. 작은 들짐승 한 마리로 며칠씩 견디는 일이 길어졌다. 그래서 젊은 늑대는 지금 사내를 발견한 일이 자신에게 잘 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은 딱 숨만 붙어있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했다.
작게 으르렁대던 늑대는 천천히 모습을 바꾸어갔다. 털에 뒤덮여 있던 몸은 매끈해지고 네 발로 서 있던 몸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금색의 눈동자와 은색의 머리카락이 이 사람과 방금의 늑대가 동일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돌아가라, 인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던 늑대가 사내에게 말했다. 총구를 똑바로 쳐다보던 늑대는 뒤이어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인간들은 잔인했다. 자신들에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놀이쯤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두렵지 않은가 묻는다면 두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 사내가 한 발만 제대로 쏜다면 자신은 죽을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아주 쉽게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무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늑대는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서 말했다. 그가 뱉은 말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늑대에게는 이 겨울을 죽지 않고 버티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
405 이름 없음 (4377006E+5) 2019. 6. 27. 오전 9:23:02>>404 매서운 눈보라 속 늑대의 형체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듯이 사람의 인영으로 변했다. 사내는 잠시 주저했으나 총구를 겨눈 손길에 흔들림은 없었다. 마을의 가축들이 늑대의 손에 의해 여럿 죽어나갔다. 사내에게는 그 늑대와 그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할 재간이 없었다. 사내는 그를 잡기위해 며칠을 기다렸는데, 이 추위에 더는 헛탕을 칠 수 없었다. 떨리지 않는 손길로 겨눠진 총끝에서 총탄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 매섭기는 병사의 투창에 비할 바 없었다. 눈보라는 점차 거세어 져 그 선명했던 안광마저 눈속으로 숨어버렸고 이제는 숲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형체만이 눈보라 너머에 흐릿하게 차 있었다. 사방에는 사내의 총성만이 선명하게 울려퍼졌고 시린 바람 속에서 사내는 절로 눈이 찌뿌려졌다. 늑대를 쫓으며 사방을 둘러보지만 소름끼치도록 흰 눈밭 뿐이다. 눈보라는 사내마저 삼킬듯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사내는 각오를 다지듯이 총을 쥔 손에 힘을 실었다. 멀리서 늑대의 으르렁림과 같은것이 냉바람에 실려왔다. 그가 곧 습격해 올 것이다. 사내는 중얼거림과 같은 혼잣말로 그의 경고에 답하듯이 작게 읊조렸다.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실어가고 눈보라는 다시금 앗아갔다.
"늑대는 멸해야만 한다..."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쳤고 늑대의 형상이 뚜렷해졌다 다시금 멀어진다. 사내는 비틀대듯 사방을 살피며 늑대의 형상을 쫓았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잭나이프가 함께 흔들렸다. 총과 함께 몇년을 간직한 동료나 다름없었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으나 몇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청춘과 힘을 앗아가 버렸다. 그러나 사냥꾼은 마치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듯 사냥터를 전전했으며 그의 솜씨는 현역 때 못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 총끝이 하나의 형체를 찾아 다시금 겨눠졌다.
"와라... 늑대녀석아..." -
406 이름 없음 (9769759E+6) 2019. 7. 18. 오전 5:48:27그녀가 떠난 것은 딱 1년 전의 오늘이었다.
삭막한 도시 한켠에서 친인척 없이 홀로 담담히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자신이 살던 집, 다니던 직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 연인까지도.
사소한 물건들은 모두 쓰레기장에 내놓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것들만을 챙긴 채 그렇게 말없이 사라졌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딱 1년 째 되는 오늘, 그 때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늘, 느닷없이 돌아온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였다.
"안녕. 오랜만이야. 들어가도 돼?"
마치 어제도 놀러왔던 친구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나온 그를 덤덤한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커다란 캐리어를 한 손에 끌고, 비에 흠뻑 젖은 것을 제외하면 1년 전과 크게 다를 것 없어보이는 모습으로 그가 연 현관문 밖에 선 그녀는 먹물빛 눈동자를 천천히 깜빡이며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가지런한 자세로 너무도 태연히 그렇게 서서, 그녀가 태연히 다시 말했다.
"오늘 막 와서 쉴 곳이 없거든. 며칠 신세 좀 져도 될까?"
그리 말하는 목소리에서 조금은 지친 기색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태도만큼은 담담함을 고수하며 한 발을 살짝 움직였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옛 연인'이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한번 더 울렸다.
"안 된다면 이만 갈게."
순간의 짧은 움직임에서 그녀의 왼손 약지가 살짝 반짝였다.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은반지였다. 어쩌면 그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의 것보다는 조금 낡은 그런 반지를 낀 손이 캐리어를 쥔 채 그의 앞에서 다시 떠나가려 하고있었다.
//말없이 떠난 여자와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기다린 남자로 한번 돌려볼 사람? 텀 길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이어줘. -
407 이름 없음 (4971531E+6) 2019. 7. 18. 오전 11:57:39>>406 그는 문틈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이제는 저와 아무런 사이도 아닌 이의 말을 속 모를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만 있던 그는 가겠다는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그러시죠. 안녕히 가시길."
여자의 눈 앞에서 한톨의 미련도 없이 문이 닫히고, 잠기는 전자음이 조그맣게 났다. -
408 이름 없음 (9769759E+6) 2019. 7. 18. 오후 12:38:15>>407 어.. 내가 생각했던거랑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다;;; 미련이 남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남자였으면 했는데. 미안하지만 스루할게. >>406 새롭게 이어줄 사람 있으면 이어주길 바라.
-
409 이름 없음 (6611732E+5) 2019. 7. 18. 오후 1:38:33>>406 필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나 이어봐도 될까? :3 만약 괜찮다면, 남자의 심정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랑 보이는 모습만 알려주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치가 어떤 게 좋은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
410 이름 없음 (9769759E+6) 2019. 7. 18. 오후 5:41:34>>409 오! 언제든 환영이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부탁할게. 그 편이 나도 잇기 좋을거 같고.
-
411 이름 없음 (9769759E+6) 2019. 7. 18. 오후 11:00:11갱신!
-
412 이름 없음 (0901676E+6) 2019. 7. 18. 오후 11:01:13>>406
순간 그는 잠결에 무작정 문을 열어젖힌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현관문에서 기다리는 게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렇게 쉽게 대면하진 않았을 텐데. 비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캐리어를 끄는. 안녕. 오랜만이야.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딱 1년 전에 들은 이별 통보와 겹쳐 들리는 착각이 들었다. 잠이 덜 깬 것 같다. 그가 눈 아랫부분을 짓누르듯 눈꺼풀을 감지만 사고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녀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매정히 떠나가버리더니 왜 딱 1년째 되는 날에 다시 돌아온 것이냐 이 말이다. 1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돼서? 말못할 사정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서? 딱 1년째 되는 오늘을 무슨 기념이라도 하기 위해? 아니면 그저 나를 놀리기 위해서? 그가 미간을 좁혔다. 다시 뜬 눈이 여러 감정으로 번들거린다.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은 당혹감만이 아닌. 의문, 회한, 체념, 한편 또 반가움도, 의심하기도, 번뇌하기도, 미련을 가졌던, 그리워했던 감정도, 허탈해하며 보낸,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아직 오고 있잖아. 비."
그가 마른침을 삼킨다. 들어와. 비오는 바깥에 도로 내쫓을 수 없을 뿐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겼다. 꽉 잡고 있던 문고리를 놓자 매마른 손잡이가 드러나고, 그는 엉거주춤 현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슬리퍼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은반지를 바지 주머니에 숨겼다. 함께 버리지 못하고 있던 미련을 드러내지 않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에. 아무리 아껴 오래 가지고 있은들 다시 꺼낸 물감은 굳어 있어 전과 같지 않은 것처럼, 그간의 공백이 길어도 너무 길었다. 그녀와 재회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상상해본 적은 많은데도 현실이 되니 전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바로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니.
"수건은 저기 있어."
그녀가 들어왔을 때 고민하던 그가 나무문을 가리키며 그리 말했다. 오랜만에 본 그녀가 어색하고 또 불편하다. 화장실에 가 씻으란 말도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 할 정도로. 그녀가 커피를 좋아했었나?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가 컵 두 개를 꺼내 커피 믹스를 털어넣는다. 이윽고 모락모락 오르는 김에 그의 마음이 한층 더 심란해진다.
//늦어서 미안해! 남자의 성격을 궁리하느라 좀 늦어버리구 말았어^-ㅠ 결국 남자가 미련은 많고 그리웠고 지금 반가운데, 자존심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여자의 속뜻도 모르겠어서 아씨 어쩌지;; 하고 있는 답레가 탄생했어..! 필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딸리는 마음이다ㅠㅁㅠ 느긋이 이어줘~!! -
413 이름 없음 (7607806E+6) 2019. 7. 19. 오전 12:55:45>>412
미처 한 걸음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아직 오고있잖아, 비. 간단한 한마디는 그저 밖에 비가 오니 들여보내줄 뿐이라는 의도가 역력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보이는 의도라 다른 의미가 있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허나 그녀는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고 가려던 발길을 돌려 선선히 그의 집 현관으로 들어갔다. 짧은 순간, 또각또각 하는 굽 소리가 어스름한 밤을 짧게 울렸다.
말없이 그의 집 현관에 들어선 그녀는 현관에 선 채 보이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아니, 너무 달라져서 오히려 더 익숙한 듯 느껴지는 집 안은 그가 여태 혼자임을 보여주었다. 많이 맡았던 익숙한 체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1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새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걸까. 그제야 그런 생각을 느릿하게 하던 그녀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정신을 현실로 되돌렸다.
"응. 고마워."
그가 가리킨 문을 보며 짤막히 대답하고 그제야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구두를 벗자 새하얗게 질린 작은 발이 나와 조심스레 바닥을 딛었다. 아직도 젖은 옷자락에선 물이 떨어지고 있었기에, 방바닥을 조금이라도 덜 적시기 위해 최대한 조용한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몹시 선명함에도 조금 현실성이 없었다. 그가 가리킨 문이 열리고 닫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잔잔한 물소리가 나기 시작해서야 그 조금이 사라져 겨우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저기, 나 옷 한벌만 빌려줘. 아무거나."
그가 커피를 타고 그녀가 나오길 기다릴 즈음 다시 문이 열리고 그녀가 고개를 내밀며 한 말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변함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설명이 필요하냐는 듯 제 벗은 옷가지를 들어보였다.
"캐리어 지금 열 수가 없어서. 내 옷 꺼낼 수 있게 될 때까지만 입고 있을게."
그럼 부탁해. 짧게 덧붙인 말을 끝으로 다시 문을 닫은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토닥이며 그가 옷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다렸다.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고, 행동은 더더욱이나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를 만나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냐아냐 필력 좋은 걸! 남자의 심정이 굉장히 잘 표현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 이어줘서 고마워 ㅎㅎㅎ 답레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그럼 천천히 이어주길~ -
414 이름 없음 (7607806E+6) 2019. 7. 19. 오후 4:59:04갱신
-
415 이름 없음 (4819423E+6) 2019. 7. 19. 오후 11:54:35>>413 으아악 미안 오늘 하루종일 바빴던지라 답레가 내일쯤에나 올라올 것 같아ㅠㅁㅠ 텀이 좀 긴 편이란 거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ㅠ 미안 빨리 가져오려구 해볼게!!!!
-
416 이름 없음 (3395935E+6) 2019. 7. 20. 오전 1:19:57>>413
새하얗게 질린 작은 발이 조심스럽게 실내를 가로지르고, 그녀가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는 뒤편에 대한 신경을 끊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문 너머로부터 물소리가 들렸던 때까지도 그랬다. 그는 느낀 것이다. 현실이라기엔 꿈 같다고. 그가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짓누르며 커피를 휘휘 저었다. 별안간 달라진 상황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해서인지 티스푼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김의 뜨거운 감촉이 다른 때보다 유독 선명했다.
아, 그렇지. 옷. 그 문제가 있었는 줄을 이제야 떠올리다니. 정신이 산만하게 분산되고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눈알을 빠르게 굴리더니 짧게 어, 라고 대답한 그가 제 방에서 비교적 두툼한 티셔츠와 추리닝 반바지를 찾고 문 앞에 가지런히 포개 놓았다.
"문 앞에 있어. 드라이기는 알지?"
옷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서로 옷을 빌려 입는 건 예전부터 평범한 일이었고, 단지 너무 긴 공백 때문에 생겨버린 어색함이 문제였을 뿐이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떻게 지금 태연할 수 있지? 그가 과거의 그녀를 회상한다.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먹물색 눈동자도, 늘상 태연한 태도도, 군더더기 없는 말과 행동도. 모두 1년 전과 같았다. 그저 시간만 1년 후로 바뀌었을 뿐이다. 누군가가 1년 전의 그녀를 현재로 데리고 온 것만 같았다. 그가 방을 정리했다. 이부자리도 개놓고 쓸데없는 물건은 밖으로 뺐다. 문에 대고 이따가 방에서 갈아입으라 하고는 주방에 서서 기다린다. 커피가 그사이에 식지 않았으면 했다.
천천히 나와. 그 한마디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머릿속은 계속 상황을 그리지만 입은 꾹 다물려 전과 달리 정다운 말을 일체 건넬 생각을 못했다. 가령 옷은 너 편하라고 이런저런 옷을 선택했다는 잡담이나 예전에 드라이기가 고장나버려 바꿨다는 근황도 말할 수 있었는데. 1년의 공백이 무엇이라고 그는 이를 꽉 다문 채 주머니 겉에 도드라진 반지의 모양을 훑더니 식탁 의자 등받이를 쥐고 눈길을 떨궜다. 그리고 그녀가 옷까지 입고 나왔을 때, 커피잔을 식탁 반대편에 조용히 밀며 앉아 제 몫을 두 손으로 감싼다.
"혹시 배고프면 말해."
그는 쌓인 말이 많은 듯한 얼굴이었다.
//쨘! 남자가 참 답답한() 답레 >:3! 으어어 그렇게 말해준다니 감동했어..고마워,,,,,^-ㅠㅠ 아무래도 내 글은 여러모로 퀄리티나 멋과는 거리가 멀단 생각을 평소 많이 하곤 해서 심정이라도 솔직담백하게(?) 담아내고 싶었어! 그나저나 너참치 문체 정말 이쁘다.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여성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여자 성격도 참 매력적이구...나야말로 예쁜 일상 소재에 감지덕지야 :3!! 같이 막레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구 >-0~~~~!!! -
417 이름 없음 (6293207E+6) 2019. 7. 20. 오전 6:13:38>>416
문 밖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오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당황한 듯, 짧게 뚝 끊어지는 대답이 들려온 뒤 문 앞을 가로지르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볍고도 익숙한 발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수건으로 제 몸의 물기를 마저 닦아내었다. 무겁게 젖은 머리를 마저 닦으며 이 상황이 1년 전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때와 같을 순 없다고 깨닫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녀의 상념이 꼬리를 물기 직전 문 밖에서 다시 기척이 나고 가벼운 무언가가 내려놓여지는 소리가 났다.
"응."
이어진 그의 말에 그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하고, 그의 기척이 문 앞을 떠난 뒤에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그 앞에는 거울이 있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반쯤 김이 서린 거울엔 새카만 먹물 같은 눈과 희게 질린 얼굴과 젖은 채 늘어진 적갈색 머리칼이 고스란히 비춰졌다. 제 모습을 낯선 것 보듯 물끄러미 응시하던 그녀가 드라이기를 집어든 건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였다.
전원을 올린 드라이기의 기계음 너머로 그가 부산히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1년 전에도 그는 종종 그랬다. 그녀가 예고없이 찾아온 날이면 저렇게 급히 방을 정돈하곤 했다. 그 행동을, 그 기척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면 소리없이 미소지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얼굴엔 일말의 감정이란 없었다. 마치 잘 만든 가면을 씌운 것마냥 단정한 얼굴이 거울에 비춰지던 중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리던 그녀는 밖의 기척이 조용해짐에 맞춰 드라이기의 전원을 끄고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을 나와 옷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잘 정리된 방 안에서 옷을 입고, 긴 머리칼을 꺼내 정리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과 같이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방 안이었다. 그의 흔적과 체향으로 가득한 방 안에 그녀의 흔적은 실오라기만치도 없었다. 그것을 새삼 확인하듯 다시 한번 둘러보고서야 그녀는 방을 나와 그가 기다리는 주방으로 갔다.
"고마워."
그가 내어준 자리에 앉아 그가 내민 잔을 받아들며 그녀가 한 말은 고작 그게 다였다.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집 식탁 의자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1년 전 풍경을 찍어 놓은 것마냥 너무나 익숙했고 그만큼 어색했다. 반쯤 식은 커피의 수면을 내려다보니 그녀의 푸르스름한 입술이 얼핏 비쳐졌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 수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잔을 들어 한모금을 마셨다. 미지근한 온기가 남은 커피를 차디찬 속에 흘려넣으니 닿은 부분부터 간질한 온기가 퍼져나감이 느껴진다. 미약한 온기가 완전히 몸에 스며들고서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문 앞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와 변함없는 시선이 그를 온전히 시야에 담았고, 혈색이 돌아오지 않은 입술이 움직여 소리를 내었다.
"잘 지냈어?"
할 말이 많아보이는 그에게 그녀가 건넨 말은 고작 그것이 다였다. 어떤 설명도, 서론도 없이 그저 그것이 궁금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히 묻고 입을 다물더니 조용히 그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ㅎㅎ 이런 부족한 필력을 넘나 칭찬해주니 몸둘바를 모르겠따...오랜만이라 불안했는데 너참치가 해주는 말 보니까 많이 안심돼! 고마워!! 너참치가 표현해주는 남자 느낌도 갱장히 쪼아 :D 너참치의 표현력 정말 리스펙트... 이대로 끝까지 잘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화이팅...! -
418 이름 없음 (6293207E+6) 2019. 7. 20. 오후 9:23:06갱신~
-
419 이름 없음 (7237139E+5) 2019. 7. 21. 오전 5:53:04갱신!
-
420 이름 없음 (5728511E+5) 2019. 7. 21. 오후 3:43:14>>416이 잠깐 갱신하고 가~ㅠㅠ 밤에 답레 줄게!
-
421 이름 없음 (7237139E+5) 2019. 7. 21. 오후 7:52:18>>420 확인 겸 갱신! 밤에 봐!
-
422 이름 없음 (2501038E+5) 2019. 7. 22. 오전 12:03:09>>417
문득 커피를 왜 두 잔 탔나 생각했다. 한 잔만 타도 충분했을 것을, 굳이 두 잔을 타서 이렇게 마주앉은 것은 손님을 늘 그렇게 맞아들였기 때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심의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을 듯해 뒤늦은 후회와 민망함이 그의 목밑을 틀어막았다. 그렇다고 무를 수도 없고. 그녀가 그의 옷을 입고 식탁 반대편에 앉았을 때 그는 잔을 입게 대며 눈을 내리깔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기 불편했다. 잔 너머로 어렴풋하게 그녀가 입은 그의 옷과 적갈색 머리카락이 요동친다. 잔을 내리면 그것은 더욱 흐려지다가 사라질 것처럼만 느껴졌다.
그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한 모금을 머금으며 잔을 내린다. 그녀가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었다. 대신 현관에서도 보았던 그녀의 담담한 먹물색 눈이, 그의 경직된 검은색 눈을 태연하게 응시한다. 잘 지냈냐고? 반사적으로 헛웃음을 지을 뻔한 걸 그가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은연중에 무마한다. 그녀의 눈에는 입은 꾹 다물린 채, 커피잔에 의지하는 듯 굳은 눈으로 미동도 없이 마주보는 그의 모습만이 비추었다. 그는 잠시 기다린 듯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없는 걸까. 설마 그걸로 끝일까, 라며. 힘이 들어갔는지 잔을 쥔 손마디가 희게 드러난다. 정말 할 말이 그것이 다인가? 그는 의문한 것이다. 1년의, 자그마치 1년이 되는 시간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 전부였나?
"....."
그는 흥분하지 않고자 했다. 감정이 격해져선 득을 보았던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는 티를 내지 않고 심호흡을 하고는 감정을 차분히 골랐다. 그저 어색했다. 너무 어색한 바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증오한 적은 없다. 떠나버린 사실에 원망은 했을지언정.
"..나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심했으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그녀를 본다. "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딘지 모를 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쩐 일로 돌아왔는지. 두 음절밖에 되지 않는 물음이었지만 그런 많은 뜻이 차곡차곡 담겼다. 그는 종종 말을 생략했다. 지금은 너무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는걸 :3!!! 부러워 필력이! 흑흑..나두 고마워...ㅅ세상에 필력으로 칭찬받는 일이 생길 줄은... 음믐믐 혹시 너참치가 생각하고 있던 흐름이 있었을지 궁금하다! :3 내가 거기에 잘 맞추어주고 있는지도 걱정되고.. 혹시 답레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음 부담없이 말해줘! 그럼 나도 끝까지 잘 부탁할게 ;>~!!!!! -
423 이름 없음 (5050199E+6) 2019. 7. 22. 오전 2:46:45>>422
잘 지냈어? 1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사람이 하기엔 너무 뻔뻔하고 낯짝 두꺼운 말이었다. 말없이 사라져놓고 예고없이 돌아와, 흐른 시간이 무색하게 구는 그녀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동시에 그녀에게서 그 이상의 말이 나올 리가 없기도 했다. 주저리주저리 긴 말을 늘어놓는 것은 그녀와 맞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필요하지 않다 느끼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래. 1년 전 오늘 사라졌을 때처럼.
손 안의 커피잔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식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곧 사라질지 모르는 허상같은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그녀의 손이 잔을 더 꼭 쥐었다. 흰 손가락이 더 희어질 정도로. 어쩌면 간절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그시 보았다. 그리고 곧 돌아온 대답에 천천히 두번,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그래."
그녀가 지독히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주의라면, 그는 때때로 말을 생략하는 편이었다. 그런 면모 역시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 전보다 더 많은 말을 생략하고 있단 걸 모를 리가 없었다. 생략하고 생략해 나온 저 짧은 말에 담긴 속뜻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손 안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짧은 말이 오가는 그 사이, 잔은 어느새 완전히 식어 싸늘했다.
잔잔히 가라앉아가는 공기 속에 정적이 또 한참을 흘렀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에 깨어있는 그녀와 그 사이를 부드러운 커피향 기류가 천천히 흘러 주방을 감싸안았다.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못한 그와 속 모를 그녀의 시간이 모래시계의 모래 떨어지듯 소리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모래가 제법 소복히 쌓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그녀가 몸을 살짝 움직였다. 조금 숙였던 고개를 드는 아주 가벼운 몸짓이었지만 제자리를 머물던 공기를 흐트러놓기엔 충분했다. 기류를 흔들고, 다시금 이 시간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시간도 늦었고, 졸려.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시선을 그에게로 돌린 그녀가 한 말은 그의 함축된 물음을 해소시켜주는 대답이 아니었다. 정말로 졸리다는 듯, 잠깐 사이 피로가 잔뜩 내려앉은 창백한 낯빛이 이 이상 대화를 이끌어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테니까."
드물게도 그녀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행여나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아달라는 것처럼. 잔을 쥐고 있던 손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르륵 풀리고, 다 마시지 않은 커피잔을 조금 밀어놓더니 식탁에 그대로 팔을 포개고 엎드린다. 도톰한 그의 옷으로 감싸인 팔에 뺨을 대고 편한 자세를 취한 그녀는 금방이라도 잠들어버릴 것 같이 눈을 깜빡였다. 그 다음 순간에라도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을 듯이 위태로운 깜빡임이 천천히 이어졌다. 시선 끝에 그를 담은 채.
//핫... 사실이라니까 더 부끄럽다으아아아앙 >ㅁ< !!! 음믐... 사실 하룻밤으로 끝낼까 했는데 새로운 전개가 생각나서! 여자가 남자의 집에 일주일 정도 채류하면서 서로 서먹하거나 혹은 옛날처럼 지내면서 드문드문 서로의 얘기를 하는? 그런 전개는 어떨까 싶어. 그만큼 핑퐁도 길어지겠지만..... 너참치만 괜찮다면 느긋하게 진행해보고싶다!! 너참치 의견도 들려줬으면 해! -
424 이름 없음 (5050199E+6) 2019. 7. 22. 오후 9:02:39갱신!
-
425 이름 없음 (2501038E+5) 2019. 7. 22. 오후 11:03:02>>423
지독히 그녀다운 짤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담은 대답을 듣고 그가 한 손으로만 쥐고 있었던 커피잔을 양손으로 모아쥐었다. 유리로 된 잔은 금방 식어있었고, 아직 전의 온기가 머물러 있는 한 손과 새로 올라온 다른 손과의 온도 차이가 명백하게 느껴져서 그는 마지못해 눈꺼풀을 내리깔듯 내렸다. 꼭 미련이 남은 것처럼, 이제는 없는 온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가 지금 품는 마음과도 비슷하게 생각되어서 그런 것일 테다. 잔은 이미 싸늘한데도.
그대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야기를 돌리려는 시도조차 않았으며 그 또한 입을 다물고 그에 대한 초조함을 비추어내지 않았다. 커피의 수면마저 일렁거리는 것을 멈추는데 보이지 않는 그의 머리는 어지러운 잡념이 가득 채웠다. 침묵은 길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멈추지 않고 방안을 채워내 온전히 자리를 대신해주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초침이 시간의 경과를 알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 때까지는. 그 가벼운 몸짓에 기류가 흩어지면서, 동시에 주위의 모든 사물이 저마다 참고 있었던 숨을 단숨에 터뜨려내는 것 같았다. 그런 착각이 일었다.
그녀의 말에 그가 시계를 잠시 눈에 담았다. 시간이 늦기는 늦었다. 당장 그도 방금 잠에서 깨었던 처지이니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자야한다는 생각을 못 떠올렸을 뿐. 그녀의 창백한 낯빛이 모자란 잠을 억지로 끌어오듯 피곤한 것이 이 이상 버티기는 힘들어보인다. 예고도 없이 돌아온 옛 애인을 집에 들이고 잠까지 몇 날 며칠 재워야한다는 사실이 그는 다소 분하기도 하였고 휘둘리는 듯한 감상도 없잖아 들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내쫓는 것은 더더욱 상상이 되지 않았다.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로써는 그건 너무 매정하지 않을까.
그는 슬슬 들어가자고 말하려 남은 커피를 입에 먼저 털어넣으려고 잔을 들었지만 곧바로 그것을 비우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순간 그가 그녀의 말의 속뜻을 파악하려는 듯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라니. 그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한편 1년 전에 사라진 행동이 도망친 것이었다는 실토로도 들렸지만. 그가 잔을 비웠다. 지금 이 시간 추궁할 마음은 버렸다. 피곤하다는데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조차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식탁 위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곧 자버릴 듯이 눈을 깜박이는 그녀를 보며 당장 필요한 물음을 던진다. 커피 버릴 거야? 라며, 피곤하면 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을 그 속에 넣어둔 그가 일어서더니 그의 잔을 싱크대에 넣은 뒤 물을 채웠다.
"내 방에서 자. 난 거실에서 잘 거니까."
조금 전에 방을 치운 까닭이기도 했다. 거실의 구석을 이불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뒷모습만 보이는 자세 그대로 물을 끄더니 돌아서선 "씻을 거면 먼저 씻고."라 덧붙인다.
//아안녕..오늘은 머리를 굴리느라 아파서 글이 평소보다 잘 써지지 않는 날이양..^-ㅠ,,, 사실 처음 쓰기 시작할 때 헉 어쩌지 막막막 어 그 어 너무 짧게 뽑힐 것 같은데..!! 한 것과 다르게 다행히 글은 길게 나왔지만..실속이 없다는 게 함정..^ㅁ^! 흑흑 일대일이면 이상하게 필력에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이 쓰인단 말야..
앗! 나도 그거 문제없고 오히려 너무너무 조아 >ㅁ<)/~!!! 내가 잡은 남자의 캐릭터는 말을 잘 생략하고 그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편인 스타일이라서 그것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무엇보다 너참치의 슥고이한 필력이랑 여자의 매력을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어서(<-사심) 넘모 좋은 거 있지~!! 그 편이 개연성이 더 잘 성립되기도 하겠다! 나도 느긋한 거 좋아하기도 하구~ >-0 어..사실 오히려 나의 너무 긴 텀으로 너참치가 지치지는 않을까..걱정되지만ㅠ..혹시 힘들면 말해줘ㅠㅁㅠ!!!!
그럼 여자와 남자의 기초적인 설정도 조금 미리 정해놔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는..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최근은 며칠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이란 거! 매일매일 출근에 야근까지() 하고 다니면 여자랑 서사를 풀어갈 시간이 극악이 되어버리니깐..핫하, 강제 휴가닷!! 아앗 그러고 보니 이름도(:3) 정해봐야할 거 가튼뎅..으음..으으으음...내 불쌍한 네이밍센스를 여기서 들킬 것 같아 두렵고만:ㅁ!!!! 너참치는 어케 생각하고 있을까?
+) 앗 그리고 말이야 혹시..나의 잡담력이 부담이 되면 말해줘^ㅁㅠ.. 나는 말이 쉽게 길어지고 쓸데없는 말도 잘 붙이길 좋아하는 스탈이지만 혹여나..너참치는 상황극에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
426 이름 없음 (4292496E+6) 2019. 7. 23. 오전 2:46:14>>425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시간의 자각은 멈추었던 모든 시간을 움직이게 했다. 공기의 흐름도, 의식의 흐름도, 멈춰있던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도 그녀의 말을 듣고서야 시간을 확인하고 그 말에 납득한 듯 했다. 그만큼 몹시 늦은 시간이었고 그녀의 몸은 이미 피로에 거의 잠식된 상태였다. 말하자마자 식탁에 엎드릴 정도였으니 오죽할까. 그러나 그는 그녀의 행동보다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신경쓰이는 듯 한순간 시선을 그녀에게 꽂았다. 찌르는 것처럼 제게 향한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내던 그녀는 더이상의 말은 하지 않고 작은 하품을 하며 팔에 얼굴을 부빌 뿐이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냐는 듯 태연해보이기까지 한 행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역시 피로해보였다. 서로가 피곤하고 간단한 생각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에 무슨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컵을 가져다놓는 소리가 짧게 들려온다. 아득히 익숙한 소리들을 들으며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녀는 짧게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무거운 눈커풀을 들어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 몸이 젖은 솜 같단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 그녀답지 않은 잡스런 생각을 머릿속에 흘리며 일어나 커피잔을 들었다.
"응."
그의 이런저런 말들에 또다시 짧게 대답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준 옷 한벌만 걸치고 있을 뿐인데, 어깨에 천근 짐을 지고 발목에 만근 추를 단 사람처럼 행동이 굼떴다. 가는 손에 들린 커피잔이 세상 무엇보다도 무거워보였다. 그렇게 느릿한 동작으로 그가 서있는 싱크대로 다가가 컵을 내려놓은 그녀가 바로 돌아서지 않고 멈춰선 채 고개를 들었다. 현관에 이어서 두번째였다. 가까이에서 그를 마주본 것은.
옅은 빗물의 향과 씻을 때 썼던 비누의 향이 미묘하게 뒤섞여 그녀의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관의 주홍빛 불빛 아래에서와 달리 밝은 형광등 불빛에 그녀의 살갗이 더욱 창백하게 보였다. 피로로 물든 눈동자는 빛바램 없는 검은 먹색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담았다. 딱 반걸음. 그만큼만 더 다가가면 옷이 스치고 살갗이 닿을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 ... 잘 자."
잠시간 지나서 나온 그녀의 말은 그게 다였다. 한마디 말을 남겨놓은 채 다시 그의 옆을 떠나 그의 방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차마 잡기 애처로울 정도로 무겁고 지쳐보였다. 어쩌면 지난 1년간의 여독이 이제 와서야 풀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밤새도록 내린 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그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두터운 비구름이 걷히지 않아 해가 떴음에도 사방이 어둑하고 눅눅한 공기가 실내실외 할거 없이 한가득 채웠다. 하늘이 밝아지지 않아서인지, 피로 때문인지. 그녀는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이불에 묻힌 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다.
//음음 그런 걱정 노프라블럼! 너참치의 필력은 답레를 받을 때마다 두근거릴 정도로 좋으니까 걱정말라구! (^ㅇ^)9
의연이 잘 맞아서 다행이다. 혹시나 너무 길어지는게 싫다면 어쩌나(...)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휴우우...안심이야! 나도 남자의 다음 행동이나 여자의 행동이나 말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막 기대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좋아 ㅎㅎ 아, 아 텀은 이대로도 괜찮아. 아 그래도 하루에 한 턴은 주고받고싶으니까 혹시나 답레 못 잇는 날은 늦게라도 한마디 남겨줬으면 해! 그 외로는 다 괜찮아 오케이야 오케이~
기초적인 설정은, 음... 어, 여자는 일단 무직에 집도 없는...네...날백수입니다.... 그러니 하루종일 집안에만 있을 예정이지! 하지만 과연 같이 있다고 말이 많을지는....나도 의문입니다(?????) 키는 한 163 정도에 딱 중간 체형에 머리가 좀 긴? 평상시 무표정이 기본인 그런 이미지로, 응. 이름은... 음.... 으음......... (고뇌)(고뇌) 신 유설, 설이라고 불렸었던 걸로! 지금도 설이라고 부를지는 남자의 선택에 맡기겠어 후후..... 글고 나도 잡담 있으면 좋아. 이렇게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거 재밌잖아 ㅋㅋ 갠춘갠춘하니까 걱정말구 하고싶은말 다 풀어! 응! 너참치 하고픈거 다해!! (???) ㅋㅋㅋㅋ 그럼 다음 답레에서 봐~ -
427 이름 없음 (4292496E+6) 2019. 7. 23. 오후 7:22:28갱신!
-
428 이름 없음 (0923095E+5) 2019. 7. 23. 오후 11:01:30>>426 안녕!ㅠㅠ 오늘 밤에 답레 올리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전하러 왔어ㅠㅠㅠ 두통이 너무 심해서..조금 쉬었다가 답레 줄 수 있을 것 같아ㅠㅠㅠㅠㅠㅠ미안해..
-
429 이름 없음 (4292496E+6) 2019. 7. 23. 오후 11:16:40>>428 앗아아..! 두통ㅠㅠ힘들겠다... 응응 알았어! 푹 쉬고 나은 다음에 천천히 써와 ㅎㅎ 나 기다리는거 잘하거든!! 부담갖지말고 푹 쉬엉~ 아픈거 얼른 낫길 바랄게 >:3 힘힘!!
-
430 이름 없음 (4408795E+6) 2019. 7. 24. 오후 6:48:37갱신!
-
431 이름 없음 (916936E+60) 2019. 7. 25. 오전 12:13:06>>429 움직이면 다시 아파오는데(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응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ㅠㅁㅠ..!! 지금부터라도 쓰기 시작하려구..글 쓰는 거 많이 느린지라,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줘!!ㅠㅠ
-
432 이름 없음 (3201051E+6) 2019. 7. 25. 오전 1:54:36>>431 나도 막상 답레는 작정하고 써야될 정도로 느린걸ㅋㅋ;;; 괜찮아 천천히 써왕ㅎㅎ 느긋하게 기다릴게~
-
433 이름 없음 (3201051E+6) 2019. 7. 25. 오후 7:37:59갱신!
-
434 이름 없음 (916936E+60) 2019. 7. 25. 오후 8:36:43>>426
그녀의 움직임이 느렸다. 마치 입은 옷이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어깨가 무거운 듯 굼뜨게 일어선 그녀가 걸어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한결 같았지만 그는 재촉하거나 하지 않았다. 차분한 것인지 차분함을 가장하고 있는 건지. 그녀가 예상치 못하게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친 순간에도 별다른 기색을 내비추지 않는 것이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어딘가 건조해보였다. 잠에서 깬 뒤로 너무 많은 일이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갔으니 지쳤을 법도 하다. 형광등 불빛 때문인지 조금 전보다도 창백하게 질려있는 그녀의 얼굴이 더 가까워져 오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으며 그는 그대로 서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가 잘 자란 한마디를 남겨놓곤 지친 뒷모습으로 방으로 향할 때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방문에 감추어진 때야 흐트러졌다.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얼굴을 쓸어내린 그가 화장실로 들어가 칫솔을 입에 물며 내일부터 할 일을 고민했다. 집에만 있는 며칠동안 그녀와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잖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거울 너머에서 다소 충혈된 눈을 깜박이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 답답함보단 피곤함이 극심했다. 적어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자야했다.
그가 그날 밤을 잠 대신 고민으로 지새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을 체감한 그가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어젖혔다. 9시 43분. 평소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밴 그답지 않은 기상 시간이었다. 기껏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더니만 바깥 공기도 별다를 게 없었다. 그가 낮게 씹어 뱉었다. 젠장. 시간 관념도 엉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공기청정 기능으로 맞춘다. 씻고 나오니 그나마 나아진 공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가 이부자리를 갠 뒤 쌀을 씻고 밥솥에 눌러놓는다. 분명 휴가 기간인데 평소보다 바빠진 것 같았다. 안 하던 아침밥도 하고. 전 연인은 당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설마 정오까지 그러고 있을까. 그가 묘한 표정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자고 일어나니 정신이 맑아진 듯하다, 아니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욕지거리로 하루를 시작한 것 말고 특별한 고민이 들지 않는 것이 아침 특유의 둔감한 상태다.
싱크대에 버티고 있던 커피잔 두 개를 씻어 걸어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몇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방에 아직 자고 있을 전 연인에 대한 고민이 보자기를 들춰내듯 다시 모습을 비춰내기 시작해 표정을 찌푸린 그가 검색창에 '전 연인'이라 검색하려다 만다. 우습다. 그리 자조하다가 시간을 본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설마는 했지만 이 시간까지 잘 정도로 피곤한 건가. 오랜만에 오는 옛 연인의 집이 불편하지도 않나보다. 아니면..깨어있는데 나오지 않는 걸 수도 있고.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이 물밀려오듯 떠올랐다. 그때 느낀 불편한 감정들도. 그가 이제야 현실 감각을 되찾는다. 다른 곳도 아닌 제 방문 앞에서 남의 집인양 머뭇거리는 모습이 그렇게 어색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그가 손가락 마디로 문을 두드린다. 똑똑.
안 일어나? 깼어? 밥 안 먹어? 언제 일어날 거야? 꺼낼 수 있었던 온갖 물음이 목끝까지 올라왔다 도로 들어가기를 연달았다. 이 상황에 어색하지 않게 깨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가 입안 살을 자근자근 씹었다. 한심하고 진저리가 났다. 많은 감정을 억누른 그가 낮은 목소리를 겨우 문 너머로 던졌다.
"..아직 자?"
//드디어 다 썼다! 휴..^ㅁㅠ!! 기다려줘서 미안하구 정말 고마워 너참치ㅠㅠ! 고마움의 뜻으로 된다면 기프티콘이라도 선물해주고픈 마음이야!!ㅠㅠㅠㅠ
나도 사실 이거 ㅇ일상이 뭔가 딱 길어질 각이라서 괜찮..을까:ㅁ..소심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참치가 길게 이어나가자고 제안해서 매우 기뻤지 뭐야~ :3 그렇게 말해줘서 부끄럽지만 고마웡ㅋㅋㅋㅋ나도 마찬가지 마음이야! 글구..이번엔 몸이 조금 안 편해서 그랬구 앞으론 하루에 한 턴 할 수 있을 거야 >-0~!!!
웅응 여자는 모든 걸 정리하고 훌쩍 떠났다고 먼저 설정했으니까...:D.... ㅎㅎㅎㅎ그럼 24시간 어색함 익스프레스x N일 이네??ㅋㅋㅋㅋ ㅋ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 남자에게 묵념,,,,, 앗앗 내가 딱 상상하고 있는 여자 모습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지 모르겠다! 적갈색 머리카락이라니 거기서 우왕 싶었구..헉 이름 옙브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 게다가 애칭이라니ㅠㅠ 남자 성격에도 나름 맞구 좋아~! 남자는 자존심 개세서(...) 아직은 다시 그렇게 못 불러ㅋ큐ㅠㅠㅠㅠㅠㅠ 남자는..남자는.... 키는 적당히(?) 175cm에 체격도 평균에 전형적인 한국인스런 생긴 게 좀 딱 봐도 기세보이는() 딱딱한 인상이라고 하자! 그렇게 잘 웃진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걸 잘하는 스타일? 글구 이름은...ㅋㅋ...이름은....(머리뿌쑴) 최시환 이라고 하자!! 딱 삘이 왔어(??)...자존신 센 이름.... <- ??? 여자가 성격상 이런 걸 할진 잘 모르겠지만 환이라고 애칭해도 돼~!!^ㅁ^!!
핫 그렇다니 다행이야~!! 담백하게 상황극하고픈 사람들도 간혹간혹 잘 보이니까 물어봐야지! 했는데 취향이 맞아서 다행이야ㅠㅠㅠ 하고 싶은 거 다해야지~~ 막나가야지^-^~~~~~!!!!!! 가 아니라 너참치도 하고픈거 다해!!! >-0 담 답레서 봐! -
435 이름 없음 (3201051E+6) 2019. 7. 25. 오후 11:54:38>>434
푹신한 이불과 편안한 잠자리, 기억 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리운 체향은 그녀가 오랜만에 아주 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편안한 잠은 사흘, 아니 일주일만이었다. 편안한 만큼 깊게 잠들어서 좀처럼 깨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정오까지 되자 아주 어렴풋하게 정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자신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낯선 듯 익숙한 이 향이 스며든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그곳은 이미 자신이 떠나온 곳이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 좋지 않은 꿈을 꾸는가 했는데. 의식이 또렷해져올수록 제 몸을 덮고 있는 촉감이 점점 선명하게 느껴져온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녀의 무른 판단을 부수듯 노크소리가 들려오고 꿈에서나 듣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의식을 단박에 물 위로 끌어올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 앉아있었다. 마치 긴 악몽을 꾸다 깬 것처럼 놀람으로 가득한 그 얼굴은 잠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었으나 곧 놀랐던 기색이 사라지며 잠에서 서서히 깨어났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쉰 다음에야 문 밖에서 들려온 말에 대답할 수가 있었다.
"응. 지금 깼어."
푹 잠겨 가라앉은 목소리가 방금 깼다는 그녀의 말을 받쳐주기라도 하는 듯 했다. 느릿느릿 움직여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킨 그녀는 그대로 문으로 걸어가 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 그 밖에 서 있었을 그를 한번 올려다보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다.
"덕분에 잘 잤어."
오래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듯, 짧게 말하고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간다. 거실을 가로질러가는 동안 제법 생쾌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늘 그녀보다 부지런했던 그는 이미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지 제법 되어보였다. 말끔히 정돈된 거실을 지나쳐, 현관으로 가니 전날밤 세워둔 캐리어가 그대로 있었다. 물기가 마른 캐리어를 한번 툭툭 털고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뒤 두 손으로 조금 힘겹게 들었다. 제 몸집만한, 아니 그보다 더 큰 투박한 캐리어를 들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은 그녀 특유의 고집스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듯 했다. 남에게 잘 기대지 않는 그런 면모는 1년 전 그대로였다. 흰 손이 더 희어지도록 캐리어를 꾹 쥐고 방 앞까지 돌아간 그녀가 그제야 그를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욕실이랑 방 좀 쓸게. 세탁기도. 내 건 내가 할테니까. 그냥 둬도 돼."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다시금 둘 사이를 갈랐다.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전날밤의 정적인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다. 그럼에도 특유의 분위기가 아우라처럼 그녀를 휘감고 있어 언제든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았다. 예를 들면, 이 문을 닫고 다시 열면 없어져 있을 것만 같은-
타악.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방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그를 보고 고개를 숙이더니 직접 문을 닫아버렸다. 선을 긋듯 단호한 행동이었다. 그 상태로 잠시 문 안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니 손에 갈아입을 옷가지를 든 그녀가 나와 욕실로 들어갔다. 1년 전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동선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오래된 필름을 재생시켜놓은 것만 같다.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평온하던 그의 일상을 흐트러놓고 있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방에는 그녀의 캐리어가 무방비하게 열려있었고 욕실에선 그녀가 씻는 소리가 아득하고도 선명하게 울렸다.
//음... 왠지 전답레보다 짧아진 기분인데...음.......(고뇌) 에이 머 텀좀 긴거 못 기다릴거야 없지! 기프티콘은 베스X라빈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헤이 넣어둬 넣어둬!
맞다 응 이제 아픈거 나은거 같아서 다행이다.. 두통이 은근히 고질병이라서;;; 썩 물렀거라! 우리 너참치 괴롭히지 마랏 나쁜 두통! 아이 나도 괜찮다고 해줘서 고맙지 ㅋㅋㅋ 응응 앞으로 막레까지 잘부탁해!!
크 어색함 익스프레스...내리실 곳은 없습니다 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내 남자야... 아니 ㅇ제 시환이구나 힘내 시환아...! 여자쪽 설정이 맘에 든거 같아서 다행이다. 첨부터 정한건 아니었는데 한두턴 주고받다보니 어느새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성되있드라...하하 뇌내 커스터마이징 대다내! (아무말) 과연 이 둘은 언제쯤 서로의 애칭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될지 기대반 걱정반이다 ㅋㅋㅋ
막 잡담하는거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아마 상대적으로 말이 없...아니 영양가가 없...다고 해야하나, 응. 아무말이 심합니다...응...이런 나라도 이어주겠니..? (뭐래;;) 아무튼 이런 잡담이라도 좋다면 열심히 써볼게!! 그럼 담 답레에서 보쟈 ㅎㅎ -
436 이름 없음 (6413435E+6) 2019. 7. 26. 오후 3:01:13갱신!
-
437 이름 없음 (6413435E+6) 2019. 7. 26. 오후 9:01:15끌올 겸 갱신!
-
438 이름 없음 (5006558E+6) 2019. 7. 26. 오후 9:02:14답레 틈틈이 쓰는 중이양 :3! 아마..오늘 밤에 보자 :3!!!
-
439 이름 없음 (3981116E+5) 2019. 7. 27. 오전 12:35:09갱신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미안한데 나 지금 하던 일이 제대로 수틀려서 빨리 수습해야하는지라 이번 밤에 못 올릴지도 몰라 답레 아니 근데 진짜 와 정말 미안해ㅠㅠ기다리게하는 거 같아서 내가 봐도 나 너무 답답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40 이름 없음 (3120061E+6) 2019. 7. 27. 오전 12:55:50>>439 으어어 아이고 너참치 말만 봐도 얼마나 다급하고 정신없는지 알거같다... ;;; 괜찮으니까 일 먼저 수습하고 진정되면 와!! 진짜 괜찮으니까!! 일이 꼬일수도 있고 막 그런거니까 응!!! 괜찮아 괜찮아 진정하구 일 잘 마무리짓구 와 ㅎㅎ
-
441 이름 없음 (3981116E+5) 2019. 7. 27. 오후 10:49:10>>435
응, 이라 답하며 지금 깼다고 덧붙이는 목소리를 문 너머로부터 들은 그가 얕게 내쉰 한숨은 안도의 의미였을까, 혹은 다른 의미였을까. 그 목소리가 어딘가 잠긴 듯해서 괜스레 깨우고 만 걸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한 순간 문이 열리자 그가 입을 닫아버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는 차게 가라앉은 얼굴로 그녀로부터 살짝 비껴간 시선을 애매한 곳에 두었다. 그녀가 꼭 그를 오래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양 어찌보면 형식적인 말을 중얼거리고 그저 지나쳐버리자 약간 배신감도 들었다. 그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로 상대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녀의 태도가 묘하게 어제 보였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와 달라 어쩐지 거리가 느껴졌기에. 품고 있었던 것 같은 일말의 희망도 배신 당하고,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입안 살을 오래 짓이겼다. 그럴 거면 반지는 왜 끼우고 있는 거지? 그가 엄지로 검지 손가락을 짓누르듯이 매만졌다. 주머니에 숨겨놓은 은덩이의 무게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충동적으로 반지를 버리고 그녀를 밖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캐리어가 내는 딱딱한 소리를 들은 그가 시선을 조금 돌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가 캐리어의 손잡이를 꽉 쥔 채로 묵묵히 캐리어를 옮기는 그녀를 그저 지켜봤다. 전 같았으면 말은 없어도 대신 옮겨줄 그였지만, 전이라는 가정하에다. 말 그대로, 전에는 그랬다.
"어."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 그는 별다른 말붙임 없이 알겠다는 뜻을 그리도 짧은 말로 알렸다. 그녀가 나왔을 때 느낀 감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음을 슬슬 확신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어제에 비해 묘하게 다른 분위기인 것이 맞다. 의도적으로 선을 긋는 듯한 행동이 그랬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나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희의를 느꼈다. 시간을 체감하고 날짜가 바뀌었는데도 그녀가 온 상황이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다니. 문이 닫히는 순간 잠시 그녀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 것이 꼭 그랬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절대 좋은 기분은 아니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다 된 지 한참 지난 밥의 적당량을 그릇에 퍼넣고 달걀을 꺼내 프라이팬 위에 깼다. 그때 그녀가 옷가지를 챙긴 채 방에서 나와 욕실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움직임이라 할지,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할지 헷갈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가 상념을 지우며 불을 켰다. 무작정 달걀을 꺼내긴 했는데, 이게 막 일어난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었나? 차라리 빵을 꺼내는 편이 좋았나. 반찬이 더 필요할까. 간이 된 달걀을 밥그릇 앞에 내놓으면서 그가 묘한 짜증을 느꼈다. 전 연인의 밥을 차리는 바람에 저는 먹기 틀린 것도 같았다. 어제 커피 두 잔을 준비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연장선이었다. 그가 욕실 문을 흘겼다. 슬슬 나올 때도 되었는데.
그녀가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신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그가 남긴 것은 "반찬 살 거야."라는 많은 말들이 생략된 한마디와, 차려놓고 접시를 뒤집어 덮어놓은 밥과 반찬을 향해 고개를 잠깐 주억이는 행동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일 해결됐어..ㅠㅠ 기다려줘서 고마워..정말루.......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너참치 이즈 천사..날개 백 개 달린 엔젤,,,,(숭-배
안이 너참치 답레가 짧다 하믄 되나! 길이에 부담 갖진 말자~! 여유롭게 여유롭게~ <- 이 인간이 할 말 아님 너참치의 기다림력에 다시 한번 리스펙트..(큰절) 어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베스킨라빈스 마음ㅁ만큼은 백번씩 선물해줬어..흑흙...
내가 낫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일태산이 덮쳐왔지만 말야..!!(흐릿) 그래도 두통이 퇴치된 건 너참치 덕이라구 >-0★ 훟후 막레까지 잘 부탁한다 이거야!
시환이..영원히 곹옹받는다,,,,,,,ㅋㅋㅋㅋㅋㅋㅋ안이 근데 답레를 쓰면 쓸수록 얘 완전 답답하고 노답이란 말이야,,,여자..아니 유설이가 시환이를 찬 이유가 여기 있엇서...(??) 나도 점점 갈수록 캐의 이미지가 정립되드라! 대다내!!(22222) 음..으음......언젠가는 부를 수 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ㅠ 그래도 현실 연애보단 쉬울 거야~~~~!(뭔
아앗..영양가는 내가 없지! 지금은 얼른 답레를 건네주고 싶어서 조금씩 생략하고 있긴 한데..아니 생략이라니 뭐지 캐오일체가 바로 이런 건가~~~ 아니 이게 아니고 당연히 이어드리지요! 잡담이 힘들면 생략해도 괜차나 나도 가끔은 잡담 쓰기 힘들 때 있으니까() 암튼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구..굉장히 뜬이지만 담 답레에서 보쟝~~!! -
442 이름 없음 (3069525E+5) 2019. 7. 28. 오전 7:03:49>>441
그녀가 들어간 욕실에선 한동안 물소리만 흘러나왔다. 전날밤 내리던 빗소리를 닮은 물소리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는 걸 그녀도 고스란히 들었다. 머리에서부터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발등에 닿을 때마다 제 모습을 잃고 사라져가는 광경을 젖은 눈 아래로 한참을 보고 있었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꼭 저를 닮은 것만 같아, 무한히 반복되는 그 장면에 꼭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개를 들었고 머리에서 얼굴로 옮겨간 물줄기를 맞으며 미처 씻어내지 못한 어젯밤 빗물의 잔향을 씻어내렸다.
그녀가 씻는 그 곳이 그의 집 욕실이었기에 당연히 그의 샴푸나 바디워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들의 향이 1년 전과 변함없음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향수는 그리움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던가. 순간이지만 코끝에 침구에 베어있던 그의 체향이 스쳐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기억 저편에 아득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옛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 해 그녀는 서둘러 샤워를 이어갔다. 자꾸만 코를 찌르는 익숙한 향을 애써 모른 척 하며 긴 머리를 감고 흰 몸을 씻어내고 나니 더이상 그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제 몸에 잔뜩 베어버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반쯤 김이 서린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다.
흐린 거울에 아련하게 비치는 제 모습을 천천히 눈으로 훑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시선을 멈췄다. 봉긋 솟은 가슴 아래, 가는 뼈가 은근히 윤곽을 보이는 그 부분을 물끄러미 보다가 제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끝이 지나간 곳만 유난히 붉어 보였다. 아니, 붉었다. 길고 선명한 붉은 선을 한번 훑고나서 수건을 찾았다. 메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어젯밤과 같이 머리를 말리고, 챙겨간 제 옷을 입고 나왔을 땐 그가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응. 다녀와."
짧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는 그를 향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고작이었다. 어젯밤 제가 들어왔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문이 닫힐 때까지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서야 발을 떼었다. 얇은 여름 원피스 자락이 그녀가 걸을 때마다 무릎께에서 살랑살랑 흔들렸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는 조용한 걸음걸이로 주방에 가니 전날밤 커피를 마셨던 식탁에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덮어놓은 접시에 손을 대니 한지 얼마 안 됐는지 옅은 온기가 느껴졌다. 무심코 접시를 걷으려던 그녀는 문득 이걸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그 고민과 그가 나가며 한 말이 겹쳐지니 자연히 접시에서 손이 거둬졌다. 그래. 어쩌면 이건 그녀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무심코 든 탓이었다. 이제와 그가 그녀를 정성스레 챙겨줄 이유는 없었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
그리 길지 않은 고민을 마치고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집 안을 다시 한번 훑었다. 그의 성격대로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 안에 그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1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애시당초 그녀는 자신의 자취를 잘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랬던만큼 사라지거나 지우기도 쉬웠을 것이다.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던 그의 왼손을 떠올렸다. 동시에 제 손가락에 느껴지는 이물감에 손을 한번 꾹 쥐었다 놓았다. 애써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틀며 거실 한켠으로 가니 그가 전날 밤 깔고 잤을 이불자리가 보였다.
"... ... 후."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 걸은 사람처럼 얕게 숨을 몰아쉬며 정돈된 이부자리 앞에 앉았다. 보송한 이불의 겉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보고, 손을 펴 한번 쓰다듬고. 그대로 바라보다가 그 위로 조용히 엎드렸다. 그녀의 무게만큼 내려앉은 이불 위로 부스스한 머리칼이 한껏 흐트러졌다. 밝게 내리쬐는 햇볕은 없었지만 그녀의 몸을 받친 이불이 몹시 폭신하고 부드러웠다. 살짝 웅크린 자세로 이불에 한껏 묻혀있던 그녀는 깬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얕은 잠에 몸을 반쯤 잠긴 채 늘어져있으니 시간의 흐름마저도 두루뭉실해졌다.
그러고 얼마를 있었을까. 아스라히 흩어진 기억들 사이를 유영하고 있으니 그 사이로 나갔던 그가 현관을 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긴 커녕 굳게 감은 눈을 뜰 생각도 없어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호흡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가 들어와, 제게 다가올 때까지도 말이다.
//일 해결된거 축하해!! 잘 해결된거지???? 막 급하게 얘기하고 갔길래 걱정 마니 했어 ㅠㅠㅠㅠ 막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일찍 온거 보고 얼마나 안심했던지 ㅋㅋ;;; 암큰 잘 해결된거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먼일 나고 아프고 그러면 부담갖지 말구 바로바로 얘기해줘!! 괜찮으니까!!
음....엄.....시환이...힘내...ㅋㅋㅋㅋ......그래 현실보단 낫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아마도.....????? 시환이의 고뇌나 망설임 같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잘 표현되서 넘넘조아 >ㅂ< 너참치의 표현력에 백만배 리스펙트!! 몇번씩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 하 이런 너참치를 만나다니 내 올해 운은 여기 다쓴거야 분명해....하지만 여한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니 캐오일체라니 어참치가 그러면 나도 유설이와 일체화를 (하지마)(앗아...) 그랬다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는 무슨 그냥 말이 없어질 뿐이니 하지 않겠다! 나도 한 아무말 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각오하는게 좋을거야 너레더 후후..! ㅋㅋㅋ 머 서로 적당히 하고싶은 말 쓰면서 이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렇다고 해줘 제ㅂ(끌려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나도 이쯤하고 턴을 마치겠다! 담 답레에서 봐 ㅎㅎ -
443 이름 없음 (3069525E+5) 2019. 7. 28. 오후 4:30:14갱신!
-
444 이름 없음 (8043455E+5) 2019. 7. 29. 오전 2:08:02진짜심가하게 졸려서 아침네,,올릴게,,,,,,,,,,,,(롬곡
-
445 이름 없음 (759644E+60) 2019. 7. 29. 오전 2:27:54>>444 ㅋㅋㅋ진짜 정말 심각하게 졸려보인다;; 응 잘 자고 나중에 봐! 꿀잠!
-
446 이름 없음 (4192253E+5) 2019. 7. 29. 오후 10:47:01>>442
후더운 밖으로 나와 걸어가기를 몇 분, 마트 자동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소 지나친 냉기가 오늘따라 더욱 산만하다고 생각하기를 몇 초. 하여간 여름에는 적당한 것을 보기 힘들다. 매미가 울어대는 소리도 그렇고, 모기는 말할 것도 없다. 굳이 따지면 전 연인도 포함되나. 하필 돌아오는 시기가 그렇다. 정확히는 돌아올 줄도 몰랐고, 그것이 딱 1년째 되는 날일 줄도, 아직까지 반지를 끼우고 있을 줄도 몰랐다. 전 연인을 대한다는 일 자체가 썩 까다로운 종류이기도 하니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절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빵을 꺼냈다. 상념을 지우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니 거슬리는 것이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장바구니가 계산대 위로 올라간다. 바코드를 찍고 옆으로 넘기는 직원의 바쁜 손길을 흘러가듯이 보며 그가 폰케이스 뒷면에서 카드를 꺼냈다. 포인트 정립하시나요? 네. 덤으로 봉지까지 구입해 생각보다 많아진 구매품들을 담아 돌아가며 그는 영수증의 파란 글씨를 빤히 들여다봤다. 손톱으로 짓누르면 파란 자국이 새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무언가를 만지는 것은 그가 심심하거나 불편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 중 하나였다. 끝에 가 구겨버린 영수증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그가 그늘에 잠시 서며 한숨을 돌렸다. 습한 여름의 공기가 목부터 머리까지 답답하게 옥죄는 것 같았다. 영수증에서 비껴나간 손가락이 공교롭게 은반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작게나마, 시원함이 느껴졌다.
다소 느릿하게 집까지 향한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짧은 것도 아니었지만. 고르고 담고 계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했고, 돌아오는 걸음이 느렸던 탓도 있다. 대략 30분. 지금쯤 그녀도 식사를 마쳤을 테다. 제 식사는...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면 된다. 간식처럼. 현관문을 열어젖혀 들어온 그가 아직까지 덮여있는 그릇과 접시를 보고 의아해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이부자리가 다소 흐트러진 모습도, 아니, 그녀가 그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도 적잖이 당혹스러웠고 말이다. 혹시나 싶어 덮은 접시를 걷어보지만 밥은 그대로였다. 그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는다. 무덤덤한 기색을 가장하며 눈꺼풀을 눌러 감고선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를지 고민한 그는 봉지를 식탁 구석에 올려놓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 한 번 나지 않았고, 그는 살며시 무릎을 굽혀 앉고 상념에 잠겼다가 문득 그녀의 한쪽 얼굴이 일부분 보여 반히 응시했다. 반지에 잠시 눈길이 향하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까만 눈동자는 온갖 기분으로 복잡해보였지만 그러는 한편 꿈결을 쫓듯 현실성이 없고 피로해보이는 면도 있었다.
그가 무릎 위에 한쪽 팔을 올리며 가만히 머리를 기울여 기댔다.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처음으로 전 연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해도 잠이 오는 모양이구나. 피곤했던 걸까.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누워잤던 이부자리에 몸을 기댄 것은 단순 우연이었던 걸까. 은반지가 다시금 보였다. 잠시 고민했지만 한 손가락 끝을 그 위에 닿일 듯 말 듯 가져다댔다. 금방 거두어 갔으니 눈치는 채지 않았겠지. 어제부터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으니 그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희망을 살짝 가져도 괜찮은 건지, 체념해야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 어찌 대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가 길게 심호흡했다. 썩 오래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던 손이 점차 그녀의 등에 닿더니, 그가 찬찬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자칫하면 얼굴에 서릴 것 같은 어색함을 욱여 삼키려고 그리도 애를 쓴 덕분에 담담한 표정을 보일 수 있었다.
"밥 안 먹고 뭐해."
그가 그녀의 안색을 은연중에 살피며 잠깐 고민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게 낫나.
//으그야아아아악 이게 뭔 아침이야~~~~ 일에 치이느라 본의아니게 약속을 어겨버린(...) 나참치 답레와 함께 갱신이야아아아아아ㅏㅏㄱ(선 쓸라이딩 후 도게자
아앗 그때 일은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망하는 일이었어서 그랬어 :>! 걱정해줘서 고맙구,,,지금은 그 일은 괜찮아! 평소에 일에 자주 치이긴 하지만 말야^-ㅠ..나도...여유롭고 시프다.........
아ㅏ암 현실보단 수만배 낫지 않을까 >:3?! 흑흑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밖에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아직..갈길이..멀어....매력이라니 으아앙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흑ㅠㅁㅠㅠ!! 한편 너참치 보고 많이 배워가는 중이란 거 알아줘~~!! 센세..스승님 사랑합니다...(?) 으악 운을 다 써버렸을 리 읍잖아~~~!! 나참치를 만나는데 드는 비용은 운 0%야..그니깐 올해 운은 로또에 투자하자~!!!!!! <- ?????
헉 유설이랑 일체화하면 쿨뷰티가ㅏ 되는 건가,,??????? 해줘..해줘ㅓ.....(좀비)(???????) 근데 유설이 하니까 유설이 배 위쪽에 있는 흉터(아직 상처 상탠가..ㅠ) 뭐야,,뭐냐구 대체 뭐야,,,,(우름) 유설이가 ㅃㅃ하고 세속과 연을 끊은(??) 이유가 그렇게 가벼울 거라곤 생각 안 하긴 했지만 상처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다구..ㄴㅇㄱ!!!ㅠㅠㅠㅠ 으악 너참치..비설을 숨겨두고 있었구나..놀라운 준비력.....훟후..아무 비설도 준비 못한 나는 비설을 파헤치게따 >:ㅁ..!!!!!!!(삽 듦)( <- >>삽질<<할 것을 암시)
으아악 각오 챙겨야지 각오 으아악 내 각오 어디다 뒀지;;!!!!!! 세상마상 각오가 안 보이니..대신 기대하고 있을게,,,,,,(?) 응 마쟈 서로 하고 싶은 말하면서 재밌게 가자 >;3!! 으갹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올가미 투척!) 암튼 예고보다 늦어서 마니 미안하구ㅠㅠ..오레노 턴 종료! 담 답레서 보자~! -
447 이름 없음 (5737824E+5) 2019. 7. 30. 오전 6:51:06>>446
본디 잠이란 건, 깊이 든 것보다 얕게 헤메이는 것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렵다. 강렬한 자극으로 의식을 수면 밖으로 끌어내는 건 한순간이지만 어정쩡하게 흔들리는 의식을 단번에 건져내기란 물에서 은실 한 가닥을 도구없이 맨손으로 집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잡았나 싶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과 함께 흘러내려 잡히지 않은 한줄기 은실처럼. 그런 연유로 그녀 역시 그의 흔듬에도 쉬이 눈을 뜨지 못 하고 현실과 수면의 어중간한 사이를 표류하고 있었다. 기억이라는 흐름 속에서, 빛바래어가는 오래전 기억을 곁눈질하던 중이었다.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단편적으로 지나갔다. 지금과 비슷하지만 여러가지가 다른 한 집 안. 그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 쌍의 남녀. 마주 잡은 두 손. 서로의 왼손에서 빛나는 은빛. 함께하는 시간. 그 안에서 흐르는 그리운 분위기. 추억이 된 기억은 몹시 감상적이어서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보여주었다. 그로 하여금 묻어둔 감정을 차차 수면 위로 떠올렸다. 그렇게 다가오는 옛 감정에 그녀의 손끝이 닿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의식을 잠에서 건져내었다.
"... ... ㅅ... 환..."
그의 손이 닿은 등이 작게 움찔거렸다. 동시에 가냘픈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아직 잠에 취한 목소리는 물에 젖은 것처럼 무거웠고 천천히 열리는 눈커풀 아래 두 눈 역시 완전히 깬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그대로 엎드린 채 두어번 눈을 깜빡이며 제 옆의 그를 바라보던 그녀가 느릿하게 상체를 일으키더니 천천히 자세를 바꿔 다소곳히 앉았다. 그러곤 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하품했다. 일부러 소리를 죽인 것처럼 잠잠한 하품을 하고서 또 잠시간을 멍하니 보내고서야 겨우 잠에서 깬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아직 잠기운이 옅게 남아있었지만 전날밤의, 그리고 아까의 그녀의 눈으로 돌아와있었다.
"식사, 내 거 아닌거 같아서 손 안 댔어. 한사람 분 밖에 없어서."
그를 바라보며 그녀가 한 말은 그가 그녀를 깨우며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이유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듯. 태연히 말하고 치맛자락을 추스르며 제 무릎을 끌어안고서 다시 그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책망도 의문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초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다 식었겠다. 차려논 거."
잠시 그의 어깨 너머로 식탁이 있을 쪽을 본 그녀는 짧게 한마디를 더하고 고개를 숙여 제 무릎에 뺨을 대었다. 마치 한낮의 나른한 고양이처럼. 그 상태로 허공에 시선을 두다가, 다시 눈을 굴려 예의 검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것이었다. 할 말이 있는 듯, 뭔가 말해보라는 듯, 어중간하면서 의중을 알 수 없는 시선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월요일이었으니 그럴 수 있어! 응! 나도 종일 바빠서 새벽에야 겨우 확인했고... 후.... 역시 월요일은 너무 개롭다... 물론 다른 평일도....흑ㄱ그ㅡ흐드드ㅡ흐그흐흐흐그흑ㄱㄱ규ㅠㅠㅠㅠ
갈길이 먼건 나도 마찬가지야...후후.... 이런 모자란 인간한테 뭔가 배울게 있다니 오히려 영광인 걸..! 나도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ㅠㅠㅠ 엉ㅇ엉ㅓ엉어 세상 아직 살만하네요 너참치니뮤ㅠㅠㅠ 후 우리 같이 열심히 서로 배워가자!!!!
ㅋ...쿨뷰티....는.... 아마도 무리...네 절대 무리.... ((((동공초강지진)))) 지인들 사이에서 팩트폭행으로 유명한 나로선...무립니다 네 절대 무리에요... 흫허.... 대신 비설을 준비해봤습니다!! 는 사실 비설이랄것도 없는 진짜 간단한? 그런거라;;;; 음....뭐 너참치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ㅋㅋㅋㅋ 밝혀질 때를 기대하시라?!
흐허 각오하라곤 했지만 역시 답레를 다쓴 후에는 약간의 현탐으로 인해 뇌정지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 정지 어 정지가 안ㄷ)(으아아ㅏ아ㅏㅏ)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이제 더이상 했다간 손에 별개의 자아가 생길 것 같으므로 잡담은 여기까지다! 그럼 담 답레에서 !!!! -
448 이름 없음 (6941837E+5) 2019. 7. 31. 오전 9:56:48이제야 답레를 쓰기 시작한 내 현생 무엇,,,,좀만 더 기다려줘 :ㅁ..!!!
-
449 이름 없음 (2320272E+5) 2019. 8. 1. 오후 5:10:17답레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걸 말하러왔어.... 요새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되기도 했고..오늘은 또 치과에 다녀와서..더 기다리게 할 것 같아. 미안..
-
450 이름 없음 (5584406E+5) 2019. 8. 2. 오후 10:50:47>>447
자칫하면 눈치채지도 못했을 작은 미동이 그의 손끝에 닿는다. 그리고 들리는 가냘픈 중얼거림에 한참동안 눈을 그저 깜박이던 그가 결국은 손을 거두어가면서, 피곤한 얼굴인 채로 은연중에 합리화한다. 깼으니까 손은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그가 눈동자를 도르륵 굴려 다시 그녀를 봤을 때, 마침 그녀가 상체를 일으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소곳하게 앉은 것이었다. 그녀가 하품을 하면서 잠을 깰 동안 그는 무릎을 굽혔던 자세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그녀가 자고 일어났다고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었다. 어느샌가 마트에 다녀오기 전과 별다를 것 없는 시선이었다, 무엇을 기대할까.
"그거 네가 먹을 거였는데."
한 사람 분밖에 없어서, 라는 말에 어느 정도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 그것이었다. 기분이 그닥 유쾌하진 못했는지, 그가 손바닥 아래쪽으로 이마와 미간을 짚더니 꾹 누르더란다. 밥을 차리고 마트에 갔다온 사이의 시간이 약 30분이다. 그사이에 밥은 거의 다 식었겠지. 그릇을 거두었을 때 알게 모르게 차가움-적어도 뜨겁지는 않은 촉감-을 느꼈던 듯도 하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고갯짓을 한 건데 전달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갔다오는 사이에 그녀가 식사를 마쳤으면 돌아와서 큰 충돌 없이 설거지나 하는 거였는데. 그가 한숨을 집어삼켰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도 답답한 노릇이었다. 둘 다 언어에 무지한 것도 아니면서도.
여전하게도, 무릎을 끌어모은 그녀는 비교적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전 연인의 눈빛을 향해 무슨 말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관두고선 그 시선을 떨구었다. 정확히는,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그녀가 끼우고 있는 반지였다. 그녀 모르게 그가 입안의 여린 살을 깨물었다. 다 식었겠다, 라니. 지극하게 당연한 소리여서 오히려 그녀가 품은 의중을 모르겠다면 틀린 소리는 아니겠지. 썩 담담한 태도로 능숙하게 진심을 감추는 듯한 그녀와 다르게 자신은 초조해하는 티를 너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걱정까지 들 지경이었다.
한심해 죽겠다. 그가 자조를 감추며 몸을 일으켰다. 한쪽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면서, "데우려고. 먹을 거야?"라고 넌지시 묻더니 그가 답을 기다리듯 잠시 그녀를 내려다본다. 이내 발을 옮긴 그가 그릇에 담긴 쌀밥과 달걀을 차례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어느새 데워진 밥과 반찬을 식탁에 도로 올린다. 마지막으로 장을 보고 온 물건들을 적당히 정리하고는 그가 짧은 고민 끝에 단팥빵을 입에 물며 이부자리가 놓인 거실 반대편 끝에 앉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않는 듯한 눈치다. 딴 거 필요하면 말해. 그런 말은 했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선 정적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도록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이 마치 그것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저 그럴 뿐이다.
//진~~~~~~~~짜 많이 기다리게 하고 말았네.. 전에도 텀이 빠른 건 아니었어서 너무 미안하구 그렇다,,,, 정말 미안,,,,,':ㅁ 조금 사정을 설명하자면..최근에 일에 치이기도 했고, 설상가상으로 어제 그냥 검사만 받으러 치과에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랑니 발치를 하면서 빈혈 증세에 잠시 시달려서 도저히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기다렸을 너참치한테 줄 수 있는 게 며칠 늦장부린 데다 별로 긴 거 같지도 않은 답레랑 이런 잡담밖에 없어서 너무 슬프네..힝....
이야아아ㅏㅇ아압 그랭 그러자! 내가 배워가는 게 더 많겠지만 말이야 >:3!!! 헉 팩폭으로 유명했구나 너참치..:ㅁ..!! ㄱㄱㄱㄱ그럼 쿨뷰티스럽게 팩폭 날려줘,,(??) 쿨뷰티스럽게도 팩폭이 가능하지 않을까ㅏㅏ....????(뭔) 에에에에에이 내가 상판 생활을 하믄서 지금까지 못쓸 비설은 본 적 없어~~~! 간단하더래도 완전 기대하구 있으니까 언제든지 비설 팡팡 터트려주시라!!!! >:3~~~!!! 아아앗 그래 부담은 갖지 말구 말이야 :3(포담포담
으악 악 장비 정지하면 안 돼~~~~~~! 손에 별개의 자아가 생긴다니 헉 뭐야 그거 분열하면 7인의 X나 같이 되는 건가(<- ???????????) 앗 아니 이게 아니라..그럼 담 답레서 보자 이거야 >:3!!!!!!! -
451 이름 없음 (6425042E+6) 2019. 8. 4. 오후 2:10:04갱신할게 :>!
-
452 이름 없음 (6450023E+6) 2019. 9. 27. 오후 10:55:06ㄳ
-
453 이름 없음 (6118883E+5) 2020. 6. 13. 오전 8:41:04올라가랏
-
454 이름 없음 (7573072E+5) 2020. 6. 13. 오후 3:37:37(당신과 눈이 마주친 것은 평소처럼 음침하고 어두운 인상의 청년이 아닌, 그림자처럼 어둑하고 기괴한 털뭉치의 모습이었다. 마치 자력에 이끌리는 검은 자석 가루 같은 털들의 떨림이 멈춘 듯 보이고, 그 자리에서 꾸물꾸물 녹아내린다.) ...왜, 여기...과실, 다녀온다며...
#인간으로 위장한 괴물인 것을 들켰다! -
455 이름 없음 (1535791E+5) 2020. 6. 13. 오후 4:49:13신에게 버림받았다.
신을 대변하는 자들은 수단과 경전을 방패삼아 제물을 짓밟았다. 길 잃은 어린 양은 가혹한 발길질 아래 무력하게 늘어졌다. 모두가 찬양해 마지않는 조물주는 침묵으로 참상을 방관했다. 그 모습을 자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힘이 없었기에. 목소리가 작았기에. 비겁했기에.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금서를 손에 넣는 일은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했다. 교단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들의 시야 아래서 허리를 숙이는 체하며 품속으로 칼을 감추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복수하겠어.
소매를 걷자 드러난 흰 팔목에 칼을 가져다 댄다. 망설임없이 내리긋자 완성된 마법진 위로 선혈이 흩뿌려진다. 상처를 지혈할 생각조차 않은 채 어느새 빛을 내기 시작한 진을 멍하니 바라본다. 전부 헛수고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금서는 진짜인 모양이었다. 이윽고 드러난 형체에게, 신에게 버림받은 사제는 묻는다.
"너는, 악마인가?"
/악마랑 사제 스토리! 종교는 가상의 종교인 걸로~ -
456 이름 없음 (6118883E+5) 2020. 6. 13. 오후 11:22:28>>455
눈부신 빛이 꺼지고, 인간과 닮은 형태의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등 뒤에서 팔랑거리는 피막 날개와 뾰족한 귀 정도일까. 두 손에 빗자루를 든 그는, 자신을 소환한 사제의 물음에 발칵 성을 냈다.
"야! 내가 악마가 맞긴 한데, 할 일 착실히 잘 하고 있었거든?! 창고 청소중이었다고!! 왜 강제로 불러낸 거야? "
있는대로 짜증을 내던 악마는, 바닥에 고인 피를 보자 숨을 들이키더니, 손에 든 빗자루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쓸었다. 걸레가 아닌 빗자루였음에도, 빗자루가 닿았던 곳에는 핏자국은 커녕 먼지 한톨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보람도 없이, 지혈되지 않은 사제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핏방울이, 깨끗해진 자리에 툭 떨어졌다. 결국 악마는 폭발하여 빽 소리를 질렀다.
"야!!! 지혈 좀 해!! 바닥이 계속 더러워지잖아!!!" -
457 이름 없음 (1535791E+5) 2020. 6. 13. 오후 11:30:50>>456
"......"
예상과는 조금, 사실은 아주 많이 다른 악마의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허둥지둥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목을 감쌌다. 경전에 묘사된 악마는 모두 뿔이 달리고 팔이 네 개에 기다란 송곳니를 가진 존재였는데. 지금 이자의 모습은 귀와 날개를 빼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게다가 결벽증이 있는 악마라니, 소문으로도 들어본 적 없다.
"...정말로, 악마가 맞는 건가?"
때문에, 사제가 의심을 담아 다시금 질문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교단에게 복수할 만한 힘과, 계약을 통해 그 힘을 제공해 줄 악마였다. 신이한 빗자루는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지만, 지금 예배당 창고 바닥이나 쓸자고 그 품을 들인 건 아니지 않나. -
458 이름 없음 (6118883E+5) 2020. 6. 13. 오후 11:56:57>>457
"아, 그렇다니까!! 왜, 뭘 기대한 건데? 이게 내 일이라고!"
내가 아닌 인간놈들이 어지른 자리를 치우면서 월급 받고 먼지 한톨이라도 놓치면 쪼이는 거 말이지... 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청소의 악마는 사제가 팔을 지혈하자마자 바닥을 쓸며, 흡사 나이많은 인간들 중 꼰대라 불리는 이들과 흡사한 투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요오즘 사제란 것들이, 어? 악마 소환한답시고 바닥에 피나 뿌리고 말이야. 한두번도 아니고 일하다가 강제로 불려가서 내가 일일히 치워야 하니 내가 빡이 쳐요, 안 쳐요. 교단을 무너뜨리고 싶다나 뭐라나... 그렇게 뜻 맞는 놈들이 많으면 인간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지. 그왜, 어린 인간들 노래중에 있잖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어린 인간들도 아는걸 으~른이나 된 놈들이 말이야, 쯔쯔..."
꼬장을 속사포처럼 늘어놓던 악마는, 이미 깨끗해지다 못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바닥을 보고 아차해서는 빗자루질을 멈췄다.
"요는! 신전 좀 깨끗이 써라, 니네들이 불시에 어지르면 감봉당하는 건 나라고! 용건 더 있냐? 없으면 나 창고 청소하러 간다?" -
459 이름 없음 (9553113E+5) 2020. 6. 14. 오전 12:08:59>>458
"잠깐만."
걸고 넘어지고 싶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예를 들면 저 정체 모를 노래라던가— 악마의 말 중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자신 외에도 교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마를 소환한 사제가 있었다니. 그것도 한둘이 아니란다. 이건 중요한 정보였다. 다급한 마음에 악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어디서? 숫자는 얼마나 되던가? 다들 어떻게 되었지?"
금서를 통해 악마와 계약할 생각까지 했던 건, 혼자 힘으로는 교단을 어찌해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륙 전역을 휘어잡은 교단의 힘은 막강했다. 하지만 자신만이 아니라면. 교단에 반발심을 품은 이들이 또 있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옷자락을 부여잡고 사제는 간절한 눈으로 악마를 올려다보았다. 참고로 이 사제, 아직 성년식 전이었다. -
460 이름 없음 (4512389E+5) 2020. 6. 14. 오전 12:28:17"잉?"
불시에 옷자락을 잡힌 악마는 눈을 땡그랗게 뜨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심드렁하게 하나 하나 대답했다.
"그래, 봤고말고. 야, 여기 방이 얼마나 많은데 기억하겠냐?! 한두번도 아니고 일거리 늘리는 인간 놈들 위치까지 기억할 여유는 없다고. 망할 처형식까진 안한 걸 보면 적어도 뒈지진 않았으니까..."
악마는 힘을 주어 사제의 손아귀에서 옷을 빼낸 후, 마저 일갈했다.
"니가 찾아!! 인간 놈들 낯짝 기억하는 취미는 없으니까 답답하면 니가 스스로 찾아라, 알겠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새 잊어먹었냐! 하긴 머리에 피도 덜 마른 애한테 사제 감투를 씌우니 이리 되지, 요오즘 인간들이란 악마만큼도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에잉, 쯔쯔쯔. 용건 끝이면 간다! 나 바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악마는 몸에서 빛을 내더니 그 자리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빛으로 흩어지듯 사라졌다. -
461 이름 없음 (9553113E+5) 2020. 6. 14. 오전 12:41:17>>461
확실히, 악마를 소환하다 걸렸다면 제명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아마 이단을 심판한다는 명목 하에 성대한 화형식을 벌였겠지. 교단의 눈을 피해 잠적했거나, 순종을 가장하며 칼을 갈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문제는 그걸 어떻게 혼자 힘으로 찾느냐였다.
애초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온갖 고생을 해가며 악마까지 소환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처 항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라져버린 악마에, 사제는 텅 빈 방 안을 망연히 쳐다보았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퍼뜩 정신을 차린 사제는 황급히 바닥을 나뒹굴던 금서를 집어넣었다. 이미 한 번 성공했는데 두 번이라고 못할쏘냐. 복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할 각오 정도는 되어 있었다. 허둥지둥 진을 그리고 손수건을 푸는 손이 떨렸다. 아직 멎지 않은 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금 진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드러나는 형체에 대뜸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부터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사제는 절박했다.
"도와주십시오!" -
462 이름 없음 (4512389E+5) 2020. 6. 14. 오전 1:36:28"이제 다시 창고 청소를 해볼....."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빗자루를 잡으려는 찰나, 온 몸이 빛으로 휩싸였고, 악마는 다시 강제로 사제 앞에 와 있는 자신을 보며, 분노와 짜증에 찬 그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니가 알아서 찾으라니까?! 난 청소해야 한다고!! 또 또 어질러놓은 거 봐라. 아유, 속터져. 이래서 인간놈들이란 젊은 거든 늙은 거든 에잉 쯔쯔....."
악마가 이제는 분노를 담아 빗자루질을 하며 핏방울과 진을 치우자, 이제는 빗자루가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일었다. 빗자루질을 마치고, 악마는 크게 숨을 들이 마신 뒤 따따따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악마가 인간놈들 수소문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 무엇보다, 내 업무 시간에 딴짓해서 일 못하면, 그러다 짤리면 네놈이 책임질 테냐, 어?! 내 업무 방해한 거 참아주고, 네놈 동료 후보가 존재하고 안 뒈졌고 교단 안에 있다는 거까지 알려줬으면 됐지 대체 뭘!! 바래!!!"
한바탕 꼬장을 부린 뒤, 악마는 한숨을 푹 쉬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한숨을 푹 내쉬고, 미간을 짚었다.
"...머리에 피가 덜 말랐으니까 봐주는 거다, 운 좋은 줄 알아..... 좋아, 이렇게 하자. 내가 특별히, 날 귀찮게 한 놈들을 잡아다가 이곳에 몰아넣어주마. 대신, 그동안 예배당 창고를 먼지 한톨없이 빛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번 일 이후로 또 날 부르면 네놈 머리에 피가 말랐건 안 말랐건 이 빗자루로 너도 청소해주마."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한마디 내뱉은 악마는, 이내 허리에 손을 얹고 일갈했다. "알아들었으면 움직여!" -
463 이름 없음 (3470308E+5) 2020. 6. 17. 오후 5:05:16이제는 이유와 명분마저 퇴색해버린, 긴긴 복수극은 그날을 기점으로 종국을 맞이했다.
흙먼지 가득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손에 든 권총을 내던졌다. 탄창이 빈 쇳덩이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당신의 발치에 떨어진다. 입에 문 궐련에 불을 붙이려던 남자는 라이터에 기름이 다 닳은 것을 보고서, 바로 옆에 널브러진 사체의 재킷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작게 벌린 입에서 매캐한 담배 연기가 무던하게 뿜어져 나온다. 피와 땀으로 범벅된 그의 얼굴엔 고단함이 역력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보인다. 남자는 표정을 구기며 죽은 몸뚱이를 향해 침을 뱉었다.
"질긴 놈."
그는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채 구부정한 자세로 턱을 괴고서 당신을 올려보았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그의 표정에는 당신을 향한 연민이 담겨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나 복수의 이유 등은 상정하지 않았어.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이어줘. -
464 이름 없음 (8595097E+5) 2020. 6. 17. 오후 9:56:34>>463
이게 후련한 건가.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이 느낌을, 사람들은 후련하다고 칭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생각보다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를 마주보고 벽에 기대어 섰다. 코트가 더러워지는 걸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겠지.
"비위도 좋네."
이제는 망자가 된 이의 소지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빌리는 모습을 보고 툭 내뱉었다. 좁은 골목은 피비린내로 가득 찬 지 오래였다. 돌멩이를 구두 끝으로 살짝 차자 그를 향해 굴러갔다.
발치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었다. 총알 같은 건 진즉에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입으로 작게 탕, 소리를 내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당연하게도 나오는 건 없었다. 제 용도를 다한 권총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를 도왔어?"
시선에 담긴 연민을 알아보기란 힘들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그가 자신의 복수를 도울 이유 따위는 조금도 없었는데. 나를 동정했기에, 도왔던 것일까. -
465 이름 없음 (5497893E+5) 2020. 6. 17. 오후 11:36:46>>464
당신의 물음에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는 것이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그는 이내 체념한 듯 시선을 내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지 연민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테지.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무심한 투로 대답했다.
"도와달라며. 그뿐이야."
남자는 불씨가 남은 꽁초를 대충 바닥에 비벼 껐다. 이어서 무릎을 짚고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당신처럼 담벼락에 몸을 기대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당신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구태여 같이 가자고 붙잡을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목소리에 묻어나는 아쉬움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나 보다. -
466 이름 없음 (6319957E+5) 2020. 6. 18. 오전 12:10:02>>465
"...몰라."
복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증오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곧 제 마지막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치밀한 계획 안에 엔딩 크레딧 이후는 없었다.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 영상인 셈이었다. 지금 이 상황은. 순간 잊고 있던 피로가 엄습했다.
제 평온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작자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안겨 주는 것 이외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왔다. 여지를 남겨 둘 수는 없었으니까. 약해질 수는 없었으니까. 때문에 그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영화의 메인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복수였으니까.
"...술이나 마실까."
공허한 속내와 다르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핏줄을 알코올로 그득그득 채우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되려 전부 잊어버릴 지도.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몸을 바로 세우고 권총을 바닥에 떨구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총신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빈 총에 빈 가슴. 피에 젖은 코트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굳이 잡지는 않았다. 어차피 버릴 옷이었다.
"여기."
기적적으로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네었다. 그나마 옷을 버리는 걸로 그친 이쪽과 달리 그는 온통 피를 뒤집어쓴 채였다. 그 모습으로는 시내를 함부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할 터였다.
손수건은 일종의 메시지였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술집까지는, 함께 가주지 않겠냐는.
백수가 되어 버린 주인공은, 드디어 목표 이외의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
467 이름 없음 (8414234E+5) 2020. 6. 18. 오후 7:36:49>>466
"푸흐…"
술이나 마실까. 하는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왔다.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아직 덜 마른 핏방울이 점점이 튀겼다. 그는 제 꼴을 좀 보라는 제스처로 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였다.
검은 셔츠는 피를 가리기 위해서 입고, 하얀 셔츠는 일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입더랬다. 다행히도 그는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당신이 건넨 손수건으로 얼굴을 드세게 문질렀다. 그리고 당장 돌려줄 생각은 없는 듯 곧 검붉게 물든 손수건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궐련 한 개비를 귓등에 꽂은 남자는 당신에게 따라오라는 의미로 가볍게 손짓하고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
그는 가까운 펍에 당신을 데리고 들어와 한가진 자리에 앉히고는 알아서 주문하라는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향했다. -
468 이름 없음 (6319957E+5) 2020. 6. 18. 오후 8:02:34>>467
종업원을 불러 뭐든 좋으니 독한 걸로 달라고 말했다. 멀어지는 종업원의 등을 바라보다 작은 한숨과 함께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수십, 수백 번도 더 상상했지만 그 안에 이건 없었다. 이름도 모르는 펍에 앉아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니.
애초에,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예상 외인걸.
문득 웃음이 나왔다. 푸,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종업원이 술 두 잔을 들고 돌아왔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받자마자 크게 한 모금 삼켰다. 화끈거리는 불길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그 알싸한 고통이 생생하면서 동시에 생경했다. 나, 정말로 살아 있구나. 그 느낌이 어쩐지 나쁘지 않아 연거푸 들이켰다.
제법 작지 않은 크기의 잔이 절반 정도 줄어들자 불현듯 취기가 올라왔다. 원래도 술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었으니, 무리한 거겠지.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이제 몸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고 없는걸. 두 뺨이 홧홧했다. 서늘한 테이블에 얼굴을 갖다대자 조금은 열기가 가셨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원함을 만끽했다. -
469 이름 없음 (8414234E+5) 2020. 6. 18. 오후 11:02:52>>468
물을 틀어놓은 채로 세면대를 짚고서 몸을 숙여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것이 추악하고 흉흉하다. 이마에 주름이 지도록 눈썹을 들어올리고 손끝으로 눈 밑 살을 짚어 내리니 빨갛게 속살이 드러난다. 그 사이 박힌 조그만 파편을 조심스럽게 빼내고서 차가운 물을 연거푸 얼굴에 끼얹는다. 피 섞인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 세면대를 더럽힌다. 벽에 걸린, 누가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를 냄새나는 타월로 대충 물기를 닦아내고는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온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은 당신을 보고는 쯧. 하고 허를 차며 쓰러지듯 의자에 몸을 맡긴다. 그리고 당신이 시켜놓은, 제 몫의 술을 한입 머금고는 뒤로 자빠질 듯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인다. 입에 머금은 술로 가글이라도 하듯 입안을 헹구고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뱉어낸다. 술이 얼마나 독한지 머금었던 것만으로도 입안이 화끈거린다. 귓등에 꽂아두었던 궐련을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것으로 입가심을 대신한다.
"... 그거 기억해?"
그는 술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습관처럼 턱을 괴고서 다 갈라진 목소리로 운을 띄웠다.
"네가 나를 찾아왔던 날. 그때도 이렇게 취해있었지, 너는."
술도 못 마시는 게… 하고 푸념하듯 중얼거리고는 옛 생각이라도 나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
470 이름 없음 (5593777E+5) 2020. 6. 18. 오후 11:24:32‘이것’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한 건 고민의 여지도 없었다. 이건 아주 작은 사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세계에는 그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많았다. 사념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게 그렇게 생겨났다.
가장 처음에는 빛이 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편평한 바닥이, 오목한 구덩이가 생겨났다. 물이 구덩이를 채우고 허허벌판 위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한 일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곳은 아닌 또 다른 세계도 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겨난 세계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늘 빛이 존재했으므로 어둠은 풀이나 나무 따위에 가려진 자리에만 몸을 뉘일 수 있었다. ‘이것’은 그 세계에 질리기 시작했을 때쯤 등장했다. 맨처음에는 무어라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탓에, 무심코 눌러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죽을 만큼 약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생겨났으며 새로이 생겨날 때마다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나중에야 그것이 다른 곳에서는 ‘인간’으로 불린다는 존재와 흡사하다는 걸 알았다.
호기심은 빛이 들고 물이 채워지고 녹음이 자리를 잡는 시간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는 생각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야?”
왜 계속 해서 생겨나는 거야? 왜 죽여도 죽지 않아? 이전의 모습은 기억하니?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된 질문은 꽤 길게 이어졌다. 이제는 ‘이것’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다.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디를 향해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
471 이름 없음 (6319957E+5) 2020. 6. 18. 오후 11:33:28>>469
"...기억 안 나."
약간의 투정을 담아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잊을 리가 없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흐렸지만 결국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날이었다. 당신의 주소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믿을 수 있는 걸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 가며 만남을 회피해 왔다. 실은 그저,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를 찾아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두려웠다.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다짐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한 줌 남은 일상의 마지막 잔해에 매달리고 있었다. 멍청하게.
그래서 술을 마셨다. 자신의 주량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알코올을 있는 대로 때려부었다. 취기는 선택을 쉽게 해 주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음 보는 곳이었다. 모든 게 낯선 장소에서 단 하나, 문에 붙어 있는 호수만이 눈에 익었다. 하도 들여다봐서 외워 버린 주소였다.
마구잡이로 떨리는 손을 들어올렸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다. 문에 기댔는지, 벽에 기댔는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기댔는지. 하여간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되는 대로 내뱉었다.
도와줘.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아무리 잘 포장해도 결국은 고주망태가 돼서 초면인 사람 집에 찾아가는 짓 아닌가.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 자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웠다. 테이블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들고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독한 기운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개의치 않고 내친김에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제서야 그의 얼굴에 늘어난 상처가 눈에 띄었다. 이제야 알아챘다는 게 문득 미안해졌다.
"상처,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냐?" -
472 이름 없음 (7057074E+5) 2020. 6. 19. 오전 9:57:54>>471
그래. 하늘이 우중충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약에 취해있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지 꼬박 삼 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지. 복수라는 이름의 분풀이는 이미 끝마친 지 오래였다. 다만 그것은 잠시 통쾌함을 느끼게 했을 뿐, 약기운에 과거를 들먹이는 것 말고는 끊임없이 속을 좀먹어가는 공허함을 달래줄 길이 없었으니.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미소를 볼 수 없었기에, 그것이 무의미한 줄 알면서도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찾아보려 애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저 사람 연기를 하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녀와 닮은 곳 하나 없는 당신인데, 무슨 생각으로 집에 들였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였지. 누가 당신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짐작 가는 녀석이 몇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알아내봐야 무슨 소용이랴.
"그걸 이제야 묻는 거야?"
뒤에 덧붙일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술에 눈이 멀었지 아주. 안 괜찮았으면 이러고 앉아 있었겠냐.' 하는 말들은 "서운하네." 한마디로 대신했다. 정말 서운하다는 건 아니고, 말뿐이었지만. 가늘게 뜬 눈으로 당신을 응시하며 보란 듯이 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멀쩡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참.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했지.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랬어.
"너, 그렇게 마셔대고 또 침대에 다 쏟아놓기만 해 봐."
짓궂은 농이었다. 정말 그랬던 전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전에 같은 곳으로 돌아갈지부터가 의문이었지만. 당신은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 같았다. 연거푸 술을 넘기는 모습에 가벼운 한숨을 쉬고는 당신의 잔을 가져오기 위해 손을 뻗었다. -
473 이름 없음 (8956258E+5) 2020. 6. 19. 오후 2:51:30>>472
안면을 강타하는 담배 연기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지만 집어넣으란 말은 하지 않았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당연히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다. 그와 수없이 얼굴을 마주하는 동안 어느새 그가 피우는 브랜드의 담배 냄새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매캐한 그 냄새는 곧 그의 냄새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렇게 담배 피는 걸 보니까 멀쩡해 보이네, 뭐. 이제야 물어보냐는 말에는 할 말이 없지만. 고개를 조금 숙였다.
"...진짜 내가 그랬어?"
말도 안 돼.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갔을 리가— 아니지, 생각해 보면 애초에 술을 마시고 찾아간 것부터 정상은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릎까지 끓어도 모자랄 판에 설마 토악질을 해 놓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은 건, 자신도 결국 확신이 없어서였다. 도와달라는 말까지 꺼내 놓고 무너지듯 주저앉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어쩐지 흐리단 말이지.
뻗어오는 손에 본능적으로 잔을 몸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직 다 마시지도 못했는데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보란 듯이 한 모금을 더 마시자 슬슬 시야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물결을 타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변두리의 이름모를 펍이 아니라, 망망대해 위에서 나룻배 하나에 의존해 있는 느낌.
"...고마워."
시작은 감사 인사였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를 집에 들여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 편이 그에게는 제일 편했겠지. 그는 그저 경찰을 불러 집 앞에 웬 주정뱅이가 있다고 신고하면 끝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일어난 나도, 두 번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복수를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다. 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다.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 사실."
오늘 죽을 생각이었어.
뒷말은 속삭이듯이 내뱉었다. 가게 안의 소음에 충분히 묻힐 만한 소리였다, -
474 이름 없음 (0280963E+5) 2020. 6. 20. 오전 3:09:39>>473
나는 당신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밉지 않았다. 귀여운 거짓말. 결국엔 이렇게 제 입으로 다 불어버리고 말잖아. 그리고 정말 제가 그랬냐며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까지도. 그건 기억하나 몰라. 잔뜩 어질러진 침대 시트를 몰래 걷어 빨래해 놓은걸, 곤히 자고 있는 당신을 굳이 깨워서 널어라고 시켰던 일. 시트를 빨았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그 이유는 언제까지고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당신의 잔을 억지로 빼앗지는 않았다. 뻗었던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나도 고맙다는 인사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내게 조금 더 살아가 볼 만한 이유를 만들어준 셈이었어. 주정뱅이와 약쟁이. 답도 없는 조합이었다. 그럼에도 여태 잘 지내왔던 건 서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었을까. 서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았겠지.
내가 당신을 위하기로 한 것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복수를 달성한 자의 오지랖이었을까. 그 오만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도 모른다. 없느니만 못한 복수심을 자극한 것은 결국 나였을지도. 우연히 집어 든 낡은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아려오듯이, 까맣게 썩어버린 내 모습을 당신에게서 투영했는지도 모르지. 여리게 타는 알코올램프의 뚜껑을 닫아버렸는지도.
"사실, 뭐?"
이어지는 말은 가게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언제나 뻔뻔할 정도로 당돌한 당신이었는데, 답잖게 말끝을 흐리고서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취했잖아, 지금. 답답한 마음에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빈속에 독한 것이 들어가니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내장의 지도가 그려지듯이 찌르르한 느낌이 퍼져나간다.
"그만 일어나자. 가서 씻고 한 잔 더 하던가."
피우던 담배까지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냥 취해 보이는 당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같이 돌아가기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그럴 것을 상정한 것처럼 당신에게로 다가갔다. -
475 이름 없음 (4852384E+5) 2020. 6. 20. 오전 9:56:12>>474
그가 일전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건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굳이 되묻지 않듯이, 나 또한 굳이 다시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야 한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할 용기는 없었다.
가자는 건 역시 그의 집으로 가자는 거겠지. 남은 술을 한 입에 다 털어넣었다가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잘못하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겠는데, 이거. 나름 조심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도 순간 구십 도 돌아가는 세상에 테이블을 붙잡았다. 겨우 시야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휘청대며 펍 밖으로 나갔다. 찬 밤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을 조금 식혀 주었다.
"근데 나, 갈 데가 없어. 어제 다 정리하고 나와서."
뜬금없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젠장, 내가 이래서 술을 싫어하는데. 두뇌의 컨트롤을 벗어난 입이 어디까지 주절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픈 마음은 일절 없었다. 하지만 무식하게 술을 때려부은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것도 잠시, 입은 다시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했다.
"나 집 구할 동안만 재워주면 안 돼?"
다른 방도도 물론 있었다. 이 근방에 널리고 널린 싸구려 모텔에 장기투숙할 수도 있었고, 아직 연을 끊지 않은 극소수의 지인들 집을 전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빌려 나온 것은 가장 솔직한 속내였다. 나를 봐. 원래대로라면 난 오늘 죽었을 거야. 죽으면 머물 곳 따위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 있어. 어떻게 봐도 멀쩡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살아는 있어.
그리고 그건 아마도, 당신 공이 큰 것 같아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투정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책임지라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가족이고 뭐고 전부 죽은 지금에 와서, 내가 투정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말고 누가 있겠는가? -
476 이름 없음 (0280963E+5) 2020. 6. 20. 오후 10:39:38>>475
재워주면 안 되냐는 물음에 입술을 비죽 내밀고 어깨를 한번 들먹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당신에게 확답을 주지 않는 걸 좋아했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마음 졸이기를 기대했으니까. 왜냐면 감추려고 해도 속맘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게 퍽 재미있었거든. 여기서 만약 내가 거절이라도 했다면 우린 이대로 뻘쭘하게 헤어졌을까? 물론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술은 생각을 무디게 하고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어. 적어도 집에 돌아간 후에 그렇게 물을 생각은 하지 못했나 봐. 아직은 밤바람이 차다. 그대로 도로에 발을 내디뎌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 오늘이 당신과의 마지막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까만 택시가 우릴 데려다준 곳은 내 집으로부터 걸어서 오 분 남짓 떨어진 공원 앞이었다. 일부러 여기 내리자고 했어. 여러모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차에 타고 오는 동안 마음을 놓아서 쌓인 피로가 올라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 긴장이라는 걸 할 필요는 전혀 없었으니까. 비틀거리며 내려서는 눈에 보이는 나무 벤치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잠시만 쉬었다 가자… 하면서.
주머니를 뒤적여 겨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하지만 라이터를 쥔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옆에 앉은 당신에게 '불 좀 붙여주지 않을래?' 하는 얼굴로 손을 내밀었어. -
477 이름 없음 (4852384E+5) 2020. 6. 20. 오후 11:12:51>>476
재워주겠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저건 또 뭐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거리로 내려가 택시를 잡는 그의 뒷모습을 살짝 노려보았다. 꼭 저렇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야 직성이 풀리지.
벤치에 몸을 뉘이는 그를 따라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자 밤하늘이 한눈에 들어왔다. 별이 보이지 읺을까 조금 기대했지만, 오염된 하늘에게 바라기에는 과한 부탁이었다. 오늘의 별자리는 빌딩 측면에 들어온 수많은 불이었다.
일단 건네는 라이터를 받긴 했지만, 비흡연자인 내가 라이터를 자주 다뤄봤을 리 만무했다. 몇 번 헛손질을 하고 나서야 어설프게나마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그의 입에 물린 담뱃개비 끝에 라이터를 갖다대 주었다. 담배 끄트머리가 타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다 라이터를 돌려 주면서 충동적으로 말했다.
"나도 피워 볼래."
담배 냄새는 여전히 싫고, 솔직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피워 보고 싶었다. 당신이 피운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
478 이름 없음 (491151E+52) 2020. 6. 20. 오후 11:49:28>>477
어설프게 불을 켜는 모습이 왜 그리 귀여워 보이는지. 하도 기특해서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몸을 축 늘어뜨리고서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담배가 달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을 무심하게 올려보다가, 곁눈질로 당신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충동적이었다. 저도 피워보겠다는 말에 당신을 그러안고서 입을 맞춘 것은. 닿을 듯 말 듯 입술을 맞대고서 머금었던 매캐한 연기를 느리게 흘려보냈다. 물론… 상상 속에서. 이런 망상까지 하는 걸 보니 많이 피곤했나 보다, 나도.
"그러던가."
대수롭잖게 답하며 피우던 것을 손가락에 끼워 당신에게 내밀었다. -
479 이름 없음 (6607547E+4) 2020. 6. 21. 오전 12:44:09>>478
흠. 피워 보겠다고 한 건 새로 한 개비 꺼내 달라는 뜻이었는데 말이지. 흡연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인 것 같지는 않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쪽이 상관없다면 나도 상관없었다. 고개를 숙여 담배를 입에 물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곧바로 잔기침이 터져나왔다. 냄새로만 맡을 때보다 세 배는 족히 독한 연기에 목구멍이 쓰라렸다. 대체 이런 걸 어떻게 피는 거야? 허리를 숙이고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침을 해댔다. 괜히 객기를 부렸다가 망신당한 기분인데, 이거.
기침이 멎자 고개를 들고 다시 벤치 등받이에 기대었다. 빈속에 술을 들이부은 것으로도 모자라 계속 기침을 해댔더니 진이 다 빠졌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다. 그리고 복수. 맞아, 난 오늘 복수를 끝냈지. 그래도 알코올이 효과가 있었는지 거의 잊고 있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그를 따라하는 것처럼 후— 하고 입김을 불었다. 지금이 겨울이었다면 입김이 나와서 제법 그럴듯해 보였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입김이 나올 만한 날씨는 아니었다.
허무했다.
가슴에 구멍이 뜷린 듯한 이 기분이 무엇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았다. 허무했다. 그토록 염원했던 복수인데도, 이토록 허무할 수가 없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주는 괴리감에 몸을 떨었다.
"복수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늦게 귀가한 나를 가족들의 시체가 맞이한 날, 나 자신도 거의 죽을 뻔한 바로 그날 이후로 단 한 순간도 복수를 원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적어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진정으로 복수를 원하기는 했던 건지. 애초에 내가 뭘 원했던 건지. 지금은 뭘 원하는지.
"근데 아니더라."
복수를 원동력으로 삼아 타오르던 불길이었다.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요, 존재 이유였다. 복수가 끝나면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지도 모른다. 불이 꺼지면 전부 끝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기에 전날 살던 집과 자산을 전부 처분하고 죽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 사람과 술을 마시러 갔던 걸까. 함께 공원에 앉아 담배를 나누고, 차후의 거취를 논하는 걸까.
"살기 위해서 복수하는 거였어."
어째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가정하는 걸까.
문득 그의 어깨에 기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라면, 밀어내지 않겠지. 사실 꼭 어깨가 아니라도 좋으니 어디든 기대고 싶었다. 모든 게 불확실해진 이 세상에서 단 한 군데나마 기댈 곳을 찾고 싶었다. 망설이다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갖다 대었다. 기대었다기보다는 살짝 얹는 것에 가까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연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의 어깨 하나뿐이었다. -
480 이름 없음 (9540066E+5) 2020. 6. 21. 오전 2:02:46>>479
콜록거리며 괴로워하는 당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반쯤 남은 장초를 그대로 바닥에 버렸다. 그래, 마음이 후련하기보다는 허무하겠지. 제아무리 애써본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뻔히 알면서도 당신을 도운 것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고생했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런 말들은 당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어깨에 힘을 풀고 기대어오는 당신을 가만히 보듬어주었다.
"이제 아무 걱정 하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가 꼭 맞는 퍼즐 조각은 아니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야, 솔직히 그냥 같이 살아도 되잖아. 뭘 그리 심각해. -
481 이름 없음 (6607547E+4) 2020. 6. 21. 오전 2:41:53>>480
전신에 힘을 빼고 당신에게 온전히 기대었다. 그대로 눈을 감았다. 시야가 차단된 만큼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다. 코끝에 감도는 담배 냄새, 인적 없는 공원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는 독하고 씁쓸한 술의 뒷맛, 그리고 맞닿은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온기. 고생했다는 말을 듣자 어쩐지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천 갈래로 흩어진 숨결이 발밑에서 바스라졌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작 말 한두 마디로 전할 수 있는 심정이 아니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어떤 수식어와 미사여구를 붙여도 모자랐다.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말할 수 있겠지. 봐, 또다시 미래를 상상하고 있잖아.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덕분이야.
"...나, 당분간 당신 집에서 지내도 돼?"
결국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다. 목소리 끝이 갈라졌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그의 어깨에 얼굴을 깊숙이 묻었다. 이대로 당신 집으로 가서, 맥주 한두 캔 정도 더 마시다가, 씻고,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앞으로 어쩔 건지 고민하고.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안온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상을 살아도 되는 걸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내가.
"...이제 가자. 춥잖아."
피로 더러워진 코트는 아까 버렸고, 아무리 겨울이 아니라고 해도 겉옷 없이 맞기에는 밤바람이 찼다. 고개를 살짝 흔들고는 자세를 바로했다. 벤치에서 일어나 바지를 두어 번 툭툭 턴 뒤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잡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나중의 일이었다. -
482 이름 없음 (143025E+51) 2020. 6. 21. 오후 7:03:02>>481
도리어 이쪽에서 되묻고 싶었다. 당분간 같이 지내지 않겠느냐고.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당신이라는 존재의 유지가 더욱 간절해졌다. 누군가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지금까지 혼자 아파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있을 당신과의 평온한 일상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자. 충분히 오래도록 아파했어. 그리고 당신은 나처럼 혼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
"… 그래."
차가운 밤바람에 코끝이 시큰하다. 당신이 내민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 덤덤하게 붙잡고서 몸을 일으켰다. 만약 당신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겠지. 그러고 보니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당신이었네. 맞잡은 당신의 손이 유달리 작게 느껴졌다. 솔직하지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기분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으니까. 다만 내 마음이 손바닥의 온기로나마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어두운 밤거리로 당신을 이끌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후미진 골목을 돌아서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당신이 문을 두드렸던 현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 정경이 오늘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당신을 집 안에 들였다.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목재 테이블, 아날로그 TV가 전부인 밋밋한 거실. 한쪽 진열장에는 와인이나 위스키 따위가 줄지어 서있다. 보통은 먼저 씻으라 권하는 게 도리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지쳐버렸어. 냉장고에 맥주도 있으니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꺼내 마시라는 말을 남기고는 벽에 걸어둔 셔츠를 들고 욕실로 직행했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온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짬짬이 쓰느라 텀이 긴데도 꾸준히 이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어. 그리고 글이 참 예쁘다는 말도. -
483 이름 없음 (6607547E+4) 2020. 6. 21. 오후 7:41:02>>482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 번 들어와본 적도 없지만, 늘 어딘가 묘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편안하달지, 익숙하달지. 제 주인과 닮은 집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그가 욕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더 마실 생각은 없었다. 내일 아침에 닥쳐올 숙취를 생각하자 그럴 마음조차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쩌자고 그렇게 대책 없이 들이부은 거냐고 스스로를 탓해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 술이었다. 무릎을 가슴께로 끌어모아 몸을 웅크렸다. 긴장을 놓자마자 몰려드는 피곤에 몸을 소파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수마가 밀려왔다. 그날 아침도 소파에서 눈을 떴더랬다.
그러고 보니, 그날 아침에 시트를 널었던 기억이 나는데. 설마 나 진짜로 침대에 토했던 건 아니겠지.
그가 나오면 물어봐야겠다. 점점 멍해지는 머리로 힘겹게 생각을 이어 나갔다. 머리를 끄떡대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즈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퍼뜩 눈을 떴다. 땀과 술 냄새에 절어 찝찝한 몸을 빨리 씻고 싶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려다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고는 몸을 돌렸다.
"나 옷 좀 빌려 줘."
갈아입을 옷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당장에 돌아갈 집도 없는 처지인 걸. 그의 대답을 기다리다 문득 물었다. 최대한 태연하게,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나, 진짜 그날 토했어?"
표현이 적나라하다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었지만, 그럼 달리 뭐라고 해야 하는가. 술에 취해 침대 시트를 더렵혔느냐고? 애초에 이쪽에게는 나름 중요한 문제란 말이다. 초조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나도 텀이 짧은 편은 절대 아닌걸.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말구, 틈틈이나마 계속 이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참치도 글이 정말 예뻐:) -
484 이름 없음 (143025E+51) 2020. 6. 21. 오후 8:46:14>>483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다 그만 우뚝 멈춰 섰다.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어지간히도 신경이 쓰였나 보다. 애써 태연한 척을 한다고 해도 초조한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잖아. "아니?" 대답은 그걸로 끝이었다. 내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을 지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홱 돌려버렸다. 나,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근데 이런 모습은 아직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조금 아껴둘래. 그래서 입술을 꾹 깨물고 도망치듯 옷장으로 향했다.
사실은 그냥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랬던 거야. 유치한 심술이었어. 외로움 탓에 생긴 악취미였을지도 몰라.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과 조금이라도 더 엮이고 싶었나 봐.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떠올려주었으면 해서. 겨우 그런 이유로 멀쩡한 시트까지 걷어다 빨래했던 나도 참 우습네.
간질간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괜히 옷장을 더 뒤적였다. 그래봐야 당신이 입을만한 옷이라고는 흰 셔츠와 까만 면바지뿐이었지만. 그것들을 챙겨 수건 두 장과 함께 당신에게 건네주었다. 겨우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고서 욕실로 들어가는 당신을 뒤로하고는 냉장고를 열었고. 차가운 맥주 한 캔을 들고 와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 엄지 끝으로 캔의 입구를 몇 번 문지르고 뚜껑을 땄다.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켜고 나니 금세 노곤노곤해진다. 사실 난 독한 술을 잘 못 마셔. 눈을 감으니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다가와. 당신이 씻을 동안에만, 잠시만 쉬자. 다 씻고 나오면 어련히 깨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정신을 내려두었다. -
485 이름 없음 (6607547E+4) 2020. 6. 21. 오후 9:30:36>>484
아니라는 대답에 미간을 좁혔다. 그럼 시트는 왜 빤 거야? 하지만 곧바로 옷과 수건을 받아든 탓에 물어볼 시간은 미처 주어지지 않았다. 작지만 깔끔한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세례로 머리를 식히자 술기운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했다.
셔츠와 바지는 원래 입던 사이즈보다 커서 기장이 남았다. 하지만 빌리는 처지에 무슨 말을 하랴. 옷을 입고 머리의 물기를 털면서 나갔다. 캔맥주를 딴 채로 잠든 그를 깨워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 관뒀다. 그도 이래저래 무척 피곤할 터였다. 맞은편 바닥에 주저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생각해 보면 자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내가 보인 적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무방비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퍽 새로웠다.
한동안 그를 감상하다 충동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조심스레 얼굴의 잔상처를 하나하나 스치고 지나갔다. 나로 인해 생긴 상처. 물론 오늘 그와 싸운 건 내가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 원인 제공은 내가 한 셈이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삼자인 그를 복수에 끌어들였으니까. 입술을 깨물었다. 고마웠고, 미안했으며, ——했다. 얼마 줄지도 않은 맥주를 바닥으로 옮겨놓은 뒤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일어나. 여기서 불편하게 이러고 있지 말고 잘 거면 침대에서 자."
그리고 그쪽이 소파에서 자면 난 어디서 자라고? ...설마 맨바닥에 재우지는 않겠지. -
486 이름 없음 (143025E+51) 2020. 6. 21. 오후 11:03:13>>485
잠깐이었지만 달콤한 꿈을 꾸었던 것 같다. 몽롱함 속에 달아나는 꿈을 잡아보려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었다.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흐린 시야에 당신이 들어왔다. 자다 깬 탓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새 깊이 잠들었던 건지 호흡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약 없이는 이렇게 잠들 수 없었는데. 누군가를 앞에 두고 마음 편히 잠들었던 적이 있던가. 호흡을 가라앉히며 내 어깨에 손을 얹은 당신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 벌써 다 씻었어?"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리운 포근함을 조금만 더 느낄 수 있다면. 멍하니 눈을 끔벅이다가 몸을 뒤로 무르고 소파를 짚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꼼짝을 할 수가 없다. 무거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포기하고는 나른하게 한숨을 내쉬며 몸에 힘을 풀었다.
"네가 침대에서 자. 피곤해."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그대로 쓰러지듯이 소파에 몸을 뉘었다. -
487 이름 없음 (6607547E+4) 2020. 6. 21. 오후 11:23:46>>486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집주인을 소파에 내버려두고 침대에서 자라니, 마음이 편치 않아 있던 잠기운마저 달아나게 생겼다. 그의 어깨를 조금 더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래도 먹히지 않을 성싶었다.
"...가만 있어. 옮겨줄 테니까."
짧게 한숨을 내쉰 후 그의 등 뒤로 팔을 둘러 일으켜 세웠다. 나보다 큰 체구를 지탱하느라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였지만, 겨우 중심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취객 둘이서 오밤중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람.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침실까지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안 그래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몸은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녹초가 되어 버렸다. 그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뉘여 놓고 나도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다. 그냥 이대로 누워 버릴까. 하지만 그래서야 이 고생을 한 의미가 사라지고야 만다.
"잘 자."
이불까지 고이 덮어준 뒤 나도 소파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아까 당신이 소파에서 딱 이런 심정이었겠지. 아, 일어나기 싫다... -
488 이름 없음 (143025E+51) 2020. 6. 21. 오후 11:53:19>>487
침대에 눕고 나니 더 이상 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어려웠다. 그러는 와중에도 당신이 몸을 일으키려 할 때에 침대가 붕 뜨는 느낌만은 선명해서, 불현듯 마음이 불안해졌다.
"가지 마."
당신에게는 처음 부려보는 응석이었다. 맨정신이었다면 상상도 못 할. 그래봐야 한 집 안에서 잠이 들겠지만 왠지 떠난다는 느낌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
"… 손."
이불을 걷어내고서 손을 내밀었다. 오늘만큼은 곁에 있어주었으면 해.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었다.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만약 당신이 그냥 나가버린다면 이대로 잠이 들겠지.
//나도 이만 자야겠다. 덕분에 주말 내내 즐거웠어. 편안한 밤 보내길 바라. -
489 이름 없음 (3854382E+5) 2020. 6. 22. 오전 12:14:12>>488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연이어 마주하는 그의 약한 모습을 외면하기란 힘들었다. 손을 잡은 채로 침대에 도로 앉자 매트리스가 사람 한 명 분의 무게만큼 푹 꺼졌다. 흘러내린 이불을 도로 갈무리한 뒤 그와 마주보고서 누웠다. 정적은 곧 작게 색색거리는 소리로 물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잠들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침대 위에서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는 느낌이 썩 나쁘지 않았다. 살짝 열린 커튼 틈새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굳은살 배긴 손바닥과 얕은 숨소리만이 선연했다.
"...잘 자."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작게 속삭였다. 뒤이어 눈을 감고, 나도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막레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끊을까 아니면 일대일로 넘어가서 계속할래? 난 둘 다 좋다는 입장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의견 줘. 좋은 꿈 꾸고, 나도 즐거웠어. 고마워:) -
490 이름 없음 (45543E+52) 2020. 6. 22. 오전 6:19:20>>489
덕분에 깨지 않고 잘 잤어. 너참치는 잘 자고 있을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 꺼내줘서 고마워. 글이 잘 안 써지면 텀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일대일로 넘어가서 더 이어보고 싶어. 기다리게 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혹시 하게 된다면 말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너참치가 시리어스를 좋아한다면 약간의 스토리를 가미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 꼭 시리가 아니어도 좋고, 잔잔한 일상이 편하다면 이대로 가도 좋아. 충분히 고민해보고 의견 나눠보자. 하늘이 기분 좋게 맑다. 이번 주도 힘내자 :) -
491 이름 없음 (3854382E+5) 2020. 6. 22. 오전 7:05:26>>490 푹 잤다니 다행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줬네. 안그래도 일대일 넘어가게 되면 스토리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텀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 나도 바로바로 잇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상황이랑 글 써지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중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일만 없다면 텀은 얼마든지 길어도 오케이야. 그럼 일단 일대일 시트 스레 갱신해 놓을게. 나름 용기내서 꺼낸 이야기인데 받아줘서 고마워:)
-
492 이름 없음 (3188188E+5) 2020. 6. 24. 오전 12:43:06하하, 재밌는 얘기네. 불과 며칠 전, 친구가 보여준 소설을 성의없이 훑어보며 했던 말이다. 소설의 내용은 요즘 그렇게나 쏟아져 나온다던 ‘앗, 깨어났더니 읽던 소설의 주인공에 빙의했다!’ 같은 이야기였다. 가볍게 읽기에는 좋아보였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읽을 만큼 흥미가 일지는 않았으므로 적당히 맞장구치며 넘겼던 기억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때의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지금 내 상황을 요약하면 ‘앗, 깨어났더니 읽어본 적 없는 소설의 주인공에 빙의했다!’이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난 방은 물론이요, 주변의 사람들, 나중에야 확인한 얼굴까지 전부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심지어 나는 주인공의 이름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오랜 미디어 매체로부터 전해져 온 훌륭한 변명거리가 존재했다. 기억상실! 따지고보면 거짓말은 아니었다. 알맹이를 빼곤 전부 내 거가 아닌데, 기억 같은 게 존재할 리 만무했다. 그런데도 심각한 얼굴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저들끼리 수군덕대는 사람들을 애써 모른 척하며 진땀만 빼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됐다. 결국 한 사람이 총대를 메기로 한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 저어…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신 거죠, 아가씨?
고개를 끄덕이니 얼굴에 절망이 스친다. 미안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졌다.
- 원래 약혼자 분이 방문하기로 하신 날이라서요. 일단은 채비를 하시고…….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천천히 말하는 걸 보며 애써 웃어보이는 와중에 벌컥 문이 열렸다. 말을 이어가던 사람은 화들짝 놀라 열린 문을 쳐다봤다. 내 감상은 간단했다. …잘생겼네. 예의는 좀 없는 것 같지만.
“누구세요?”
이런 상대에게 굳이 예의를 차려야 할까? 생각이 들자마자 말이 나갔다. 옆에서 다시 좌절의 기운이 느껴졌다. 미안하긴 했다만… 미안함은 잠깐이요, 시원함은 길게 가는 법이라.
// 로판 회귀물 배경이야 ㅋㅋㅋㅋㅋ 상대는 로판 배경의 약혼자여도 좋고 똑같이 껍데기만 같고 회귀한 사람이어도, 아예 다른 사람이 들어온 상태라도 좋을 것 같아. 관심 있는 참치가 자유롭게 이어줘! -
493 이름 없음 (3895395E+5) 2020. 6. 25. 오전 1:02:46“왜 이런데서 자고 있어. 여기 돌연변이 악어 서식지인데?”
눈을 뜬 당신 앞에 쭈그려앉아 있는 건 방독면을 쓴 중성적인 목소리. 테크니컬 웨어에 이 시대에는 보기 힘든 통신 수단인 삐삐를 목걸이처럼 매고 있다.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당신은 무슨 사고를 당한건지, 혹은 다른 생물체의 것인지 알 수 없이 피칠갑이 되어 있다. 엉망이 되어버린 회색 서울의 흔한 풍경이었지만 그 어느 쪽도 무기가 없다는 점에선 서울답지 않았다. 당신이 눈을 떴는지 확인할 바가 없는지, 볼을 때리려는 듯 손을 높게 들어올렸다. -
494 이름 없음 (437973E+61) 2020. 6. 25. 오후 6:56:58>>492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영애를 보며,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짙은 붉은 곱슬머리를 높게 묶어올린 기사 그로슐라 경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담한 시선으로 방 안을 둘러보곤, 제 뒤편에 선 중무장한 병사들에게 눈짓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 방 안에 있는 이들을 포박했다. 물론, 영애까지 포함해서. 그로슐라 경은 영애에게 담담히 고했다.
"반역자 곤잘레스 공작의 가산을 적몰하고, 그의 가솔들은 엘리아고 후작가의 노예로 삼으라는 황제 폐하의 명이시네."
그렇게 고하는 그의 등 뒤로,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는 다른 공작가의 가솔들이 지나갔다. 그로슐라 경은 영애와 하녀들을 포박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끌고 가게." -
495 이름 없음 (5760346E+6) 2020. 6. 25. 오후 8:10:25>>493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기억은 빌어먹을 레이더 무리의 공격을 간신히 뿌리치고,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느악! 느흐으아아아악!!"
기립성 저혈압이 가시는 것처럼 천천히 시야가 돌아온다. 살짝 금이 간 빅 동글이 안경에 피딱지가 잔뜩 달라붙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개, 이런 개. 개새ㅡ 이런 개XX들아ㅡ!"
그래도 자기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혈투 끝에 떨쳐냈던 망할 레이더 놈들이 다시 따라붙은게 분명하다! 앞은 안 보이지만, 하여튼 지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해 맨땅에서 발광을 하다가, 자기 앞의 누군가를 몸 던져 덮쳐버렸다.
그녀ㅡ그녀라는 게 그닥 티는 나지 않지만ㅡ는 후드와 복면이 달리고 굉장히 길며 두꺼운 망토를 입고 있다. 찢어진 옷, 현수막, 방수포, 비닐 등등. 구할 수 있는 넝마란 넝마는 죄다 기워붙인 모양새라 상당히 처량하고 야성적으로 보였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쓰레기야! 이 쓰레기들아!!! 흐아아아아아!!!!!!!!!"
자기 몸을 더듬거리며 무기를 찾던 그녀. 하지만 그런 게 있을리가 없지. 그녀는 사자후를 지르며 방독면을 쓴 누군가를 메주먹으로 쾅쾅 내리친다.
사실 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쾅쾅이라기보단 투닥투닥에 더 가까워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이 여자,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다. -
496 이름 없음 (2103085E+5) 2020. 7. 2. 오후 3:10:48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순백색 눈을 선혈이 점점이 수놓았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간신히 가누어 담벼락에 기대 앉았다. 사그라드는 목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쿨럭, 하고 죽은 피를 뱉어내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누가 누굴 구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깔끔한 정장은 너덜너덜한 천쪼가리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셔츠를 붉게 물든 피보다도 더 거무죽죽하게 죽은 눈으로 당신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그렇지. 히어로 따위를 믿은 내가 등신 천치였는데. 칼에 찔린 옆구리에서 점점 감각이 사라졌다. 시린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자 갈비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젠장, 부러졌나.
"죽여."
이대로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구 없는 지옥뿐이었다.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달게 받아들이리. 히어로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다니, 퍽 빌런다운 결말이었다. 눈을 감고 도래할 죽음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기다렸다. -
497 이름 없음 (8673675E+5) 2020. 7. 2. 오후 7:40:30>>496
"흐윽, 흑. 하… 하하, 아하하핫!"
설웁게 흐느끼던 울음은 곧 카랑카랑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얼마나 우스웠는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대소를 터뜨렸다. 어깻죽지까지 내려온 칼단발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눈물을 닦아내는 손가락에 묻은 피가 젖은 눈가를 발갛게 물들였다.
"자기야~ 자기는 염치라는 게 없는 거니? 이제 와서 편하게 죽여주길 바라는 거야? 죽더라도 죗값은 다 치르고 죽어야지. 안 그래?"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당신을 매도하며 내려보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다리를 들어 구둣발을 당신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 올려놓고 지긋이 힘을 주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아프니? 얼마나 아파?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으면 안 되지. 걱정 마. 어떻게든 숨은 붙여서 데려갈 생각이니까. 어때, 앞으로가 기대되지 않니?"
옆구리에 발을 얹은 채로 허리를 숙여 당신과 얼굴을 가까이하고서 당신의 턱을 쥐어 들어 올렸다. 나른한 시선의 눈꼬리가 가늘게 호를 그리며 떨어졌다.
// 선량하지 않은 히어로가 배신했다는 느낌으로 이어봤는데, 혹시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스루해도 괜찮아. -
498 이름 없음 (229682E+48) 2020. 7. 2. 오후 8:59:28>>497 음.. 생각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어 볼게!
-
499 이름 없음 (229682E+48) 2020. 7. 2. 오후 9:45:58>>497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친 것도 죄라는 걸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어린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무시했던 이들이, 지금에 와서야 죗값을 논하다니. 궤변이었다. 누군들 좋으니 붙잡고 항변하고 싶었다. 그렇다 치면 먼저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신들이 아닌가. 나를 외면한 건 당신들인데, 어째서 그런 당신들에게 나를 벌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당장 눈앞의 이자만 봐도 정의의 수호자와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런 자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히어로라니, 이래서야 누가 히어로고 누가 빌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사실 그 둘은 처음부터 같은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단지 기회가 주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일지도.
자비없이 짓밟히는 상처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이에 질세라 셔츠가 붉게 물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은 그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모든 것이 더러운 뒷골목에서 적어도 차림새만큼은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었다. 한 줌 남은 알량한 자존심은 피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갈가리 찢어졌다. 마치 자신의 신세를 대변하는 것만 같아 입안이 썼다.
턱을 올리는 손길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신을 노려보았다. 숨을 붙여서 데려간다니. 자신의 보스가 용납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실패요 다른 하나는 도망이었다. 자신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도 한참 전에 넘었다. 이대로 잡혀간다면 보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탈취해올 것이다. 그리고 지옥도가 펼쳐지겠지. 그들이 자신을 살리는 순간 그의 목숨은 끝난다고 봐도 좋았다. 이 무슨 기이한 역설이란 말인가. 하물며 인명을 구하는 게 본업인 히어로 나으리들이!
"헛소리 마."
차갑게 비웃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당신들에게 체포되지도, 다시 그 작자의 손아귀에 떨어지지도 않으리라. 적어도 최후만큼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싶었다. 마지막 힘을 있는 힘껏 그러모아 피 섞인 침을 내뱉었다. 그리고 곧바로, 강하게 혀를 깨물었다. -
500 이름 없음 (8673675E+5) 2020. 7. 2. 오후 10:07:03>>499 괜히 내가 이어서 미안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겨달라고 했는데... 미안.
-
501 이름 없음 (229682E+48) 2020. 7. 2. 오후 10:10:31>>500 앗.. 미안해하지 말아줘8ㅁ8 난 그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이었지, 잇기 싫은 게 아니었어. 아무래도 내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한 것 같아. 기왕 시작했으니까 계속 잇고 싶었거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네.
그리고 일단 마무리가 좀 극단적으로 되긴 했는데, 저거 막레로 받지 않고 계속 이어서 써도 괜찮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라서.. -
502 이름 없음 (8673675E+5) 2020. 7. 2. 오후 10:37:15>>501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해도... 나는 더 잇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참치가 다시 잇기도 애매하게 되었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냥 넘기지 않아줘서 고마워.
-
503 이름 없음 (229682E+48) 2020. 7. 2. 오후 10:40:00>>502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
504 이름 없음 (8673675E+5) 2020. 7. 2. 오후 10:51:43>>503 아냐 그렇지 않아. 더 이상 서로 자책하고 미안해하지 말자. 고마웠어 마음이 예쁜 참치야:)
-
505 이름 없음 (229682E+48) 2020. 7. 2. 오후 10:56:04>>504 응, 나도 고마웠어 :)
-
506 이름 없음 (8856819E+5) 2020. 7. 3. 오후 11:01:45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 건 다섯 번째 이별선언을 들은 후였다. 나는 차였다. 또 차였다. 그런데 왜 쟤들은 늘 자기들이 차놓고 차인 사람 같이 굴까? 심각하게 앉아 있길래 실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견하긴 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했더니 대뜸 자길 사랑하긴 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곧바로 헤어지자는 말이 돌아왔다. 헛웃음이 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맥락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의상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길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그래, 솔직히 지쳤다. 가슴을 갈라 잘만 뛰는 심장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있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매정하기도 하지.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하는 내 말에 잘 지내라는 인사 한 마디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다. 붙잡지는 않았다. 울지 않은 게 용할 정도의 얼굴이라 괜한 말을 했다가는 일이 꼬일 것 같았다.
여태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번을 연달아 차이고 나니 정말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었다. 모든 연애가 망하는 데에 한 사람만이 영향을 끼칠 리야 없겠다만, 그래도 약간의 지분을 더 차지한 사람은 있을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제는 내쪽에 있을 확률이 컸다.
날 때부터 망한 연애를 팔자에 달고 태어났을 리는 없으니 나한테도 원인이 있을 텐데. 차가운 커피를 쭉 들이키며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S, 내 인생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던 개X끼.
걔를 만난 이후로 처음 차였을 때에는 진심으로 날 안 되게 생각하던 Y는 내가 두 번째 차였을 때 묘한 표정을 지었다가, 세 번째 차였을 때 말했다. “야…, 너 S랑 닮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알고 있어?” Y도 나도 약간 취한 상태였다.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재수없는 소리하고 있네!” 취기 때문에 적당히 말한다는 게 거의 세상에 선언하듯 외치는 꼴이 됐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Y의 말이 딱히 틀린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긴 S, 갈색 머리 S, 키가 좀 큰 S……. 그동안 거쳐온 모든 사람들이 묘하게 S를 닮아있었다. 인식하고 나니 소름이 끼쳤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연애를 여태 나 혼자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계속 닮은 사람을 찾아서! 곧바로 연애를 때려치겠다고 다짐했다. S와 속눈썹 한 올도 닮지 않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평생 홀로 살 것이다. Y에게 이 비장한 다짐을 말했더니 정신차리라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S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상황은 이러하다. 회사에서 새로운 담당자를 급하게 배정한다고 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누가 되려나 생각만 했는데 그게 내가 됐다. 담당자 변경을 요구했다는 문제의 작가는 S.
아, 이미 알겠지만 그래도 소개는 해야 하는데. 숙련된 사회인의 웃음도 보여야 하는데. 일단 내가 새 담당자라는 것부터 알려야 하는데……. 해야 할 일 리스트가 떠오르는 머리속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못하고 간신히 웃기만 했다. 거울을 볼 수 없으니 내 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닥 좋은 꼴은 아닐 것이다.
그래, Y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일찌감치 한국을 떴어야 했는데. 최소한 이 도시는 벗어났어야지.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건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후회뿐이다. 어쩌면 좋아. 비집고 나오려는 한숨을 밀어넣고 다시 억지웃음을 지었다. 어제 사표를 낼걸. 후회는 문앞에서 엎질러진 물처럼 계속 새어나왔다. 막을 방법은 없었다. -
507 이름 없음 (8856819E+5) 2020. 7. 3. 오후 11:09:12>>506 살짝 수정합니다 ;-;
(수정 전)
나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S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다.
(수정 후)
어쩌면 지금의 난 정신 못차리고 연애를 계속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Y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S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다. -
508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12:55:52>>506-507
똑똑 질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여쭈어봐도 될까요
화자와 S의 성별에 대해 혹시 생각해두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509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12:56:31#앗차 샵 안 붙였다 헷갈리셨다면 죄송합니다..
-
510 이름 없음 (4840977E+5) 2020. 7. 4. 오전 1:14:22>>508-509 화자는 여성이고 S의 성별은 따로 지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D
-
511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1:56:44>>506-507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 건 아마 네 연락이 슬슬 뜸해질 때쯤이었다. 글쎄, 나는 많은 것을 캐묻지 않았다. 바보처럼 웃는 내게 너는 바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응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보잘것없는 단어들로 네 힘을 북돋아주려 애썼다. 나의 삶 역시도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기에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었고, 또한 스스로의 삶이 있고 나서야 그 위에 사랑이 놓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나는 내 사랑이 욕심이 되어 네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난 꽤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어야 했다. 아니, 원래대로라면 상관없었을 것이다. 원래대로였다면, 나는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한- 아니 오히려 반가운 사람이었다.
얼굴 반쪽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태어난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증오와 혐오와 적의와 조롱을 받는 데에 더 익숙했다. 십여 년에 걸친 몇 차례의 재건 수술은 몇 군데의 흉터만 남기고 내게 멀쩡한 얼굴을 되찾아주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천진난만한 적의에 뿌리뽑혀 버린 인간애는 되찾지 못했다. 나는 파충류처럼 냉랭하고 쌀쌀맞고 냉소적인 은둔자로 자라났다. 그런 내게 다가온 게 너였다. 놀랍게도, 너는 내게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었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주었다. '너로 인해 나는 진정한 삶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랑을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며 시며 노래가사에 지겹도록 나온 그 문장을 너는 진정한 의미로 내게 이해시켜 주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외로움을 알아버린 마음은 홀로 내팽개쳐지자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썩어들어갔다. 썩어들어가다 못해 내 가슴 속까지 썩히고는 창에 꿰뚫린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비유적인 표현 따위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명치께를 꿰뚫고 들어와서 등을 꿰뚫고 나가 박혀 있는 듯한 고통이 나를 괴롭혔고, 그것이 심한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그 부분이었다.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마무리한 작품, "신의 사산아Atropal" 가 지금껏 내 작품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고통은 예술의 어머니라는 희극적인 증거가 아닐까. (카프카 상은 그렇다 쳐도 거기 얹어서 맨부커 상에 휴고 상 동시 수상이라니, 웃다 기절할 노릇이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 더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바쁜 삶을 살고 있는 너에게, 잔정이 많아 걱정도 많은 너에게 걱정거리를 하나 더 짊어지우는 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냥 가슴속에 우겨넣고 쑤셔넣고 나 혼자 삭이려고 했다. 그것은 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차라리 뭔가 말이라도 해봤으면, 이따름 외로워서 괴롭다고 찌질하게 토로하기라도 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 다를 건 없었던 것 같다. 너는 나보다 일을 더 사랑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최악의 형태로 아주 보잘것없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다시 껍데기만 남겨놓은 채로 마저 껍데기같은 삶을 살기로 했다. 반편이로 태어나서 비싼 돈을 써가며 아픈 수술을 받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어설프게 사람 흉내를 시도한 것부터 첫단추를 어설프게 잘못 낀 꼴이었다. '평범한 사람' 이라는 위대하고 숭고한 존재가 품고 누릴 수 있는 그 따스한 알맹이들은 나같은 어설픈 반편이 괴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 나는 터져나간 파편이나마 끌어모아 기워서는 다시금 껍데기로 살기로 했다. 뭐, 그러니 글은 잘 써지더라. 뭔가 담아보려 했던 안쪽에 이젠 볼썽사나운 그을음이 잔뜩 묻어있긴 하지만 뭐 어떠랴. 이제 이 안에 무언가를 담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내 인생이 그럭저럭 보잘것없는 비극이었는데, 잘 돌아보니 이것 참 빌어먹게 형편없는 코미디였거든.
그건 지금 미팅 장소에 나타난 담당자가 너라고 해도 변치 않을 결심이다. 너,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고 유일하게 증오하는 인간아.
편집장에게서 새로이 맡게 된 작가의 노이슈타트 상이니 카프카 상이니 하는 화려한 수상이력을 들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지만- 당신에게 동명이인 같은 편리한 기적 따위는 없었다. 독이 눈물 대신 어려있는 듯한, 소름돋으리만치 비릿한 초록색의 눈동자.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만큼 흐릿한, 얼굴 한쪽 옆면을 얼기설기 타고 내려가는 파충류의 비늘같은 수술자국 몇 갈래. 당신이 거쳐온 네 명의 S에게서는 없었던, 오직 첫 번째 S만의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S가 그 가만히 똬리를 틀고 앉아있는 맹독사같은 무감정하고 무기질적인 눈동자로 당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그런 매서운 기색이라곤 한 치도 없이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온정 가득한 빛을 띄고 있던 초록색 눈동자였건만. 그것이 다시금 그런 빛으로 돌아간 것은- 그리고 뜻밖의 재회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신이 새로 담당하게 된 작가는 여전히 키가 껑충하게 컸다. 다만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좀 수척해져 있었다. 작가는 뻔뻔하게도, 낮짝에 아무런 빛도 띄우지 않고 그 거미같은 새하얀 손아귀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P라고 합니다."
당신이 잘 아는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처음인 것처럼 다시 읊조려졌다. -
512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2:00:16# 그래서 많이 매운 와사비맛으로 들고 왔습니다
# 맵다 못해 이 캐릭터를 상대하고 싶기나 하실까 의문일 정도로 매운맛이라 조금 고민입니다
# 이 부분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513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2:03:30# >>511 수정사항 : 그럭저럭 보잘것없는 비극이었는데 -> 그럭저럭 보잘것없는 비극인 줄로만 알았는데
# 뒷사람이 패러디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불초 바보입니다 ;-; -
514 이름 없음 (4840977E+5) 2020. 7. 4. 오전 2:34:25>>512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 레스의 '나'가 S의 P라는 필명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신 레스인가요? 혹시 P가 필명이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
515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2:40:19>>514 # P는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P라는 이니셜 역시 실명에서 따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516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2:45:41# 아, 가만, 답레를 쓰는 도중에 '아직 이름이 없는 쪽'을 헷갈리는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었네요. 제 답레의 P를 S로 읽어주세요...!
-
517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2:45:56# 바보다... 나 바보다............ 88
-
518 이름 없음 (4840977E+5) 2020. 7. 4. 오전 2:53:38>>511
인생이 무료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던 건 사실이다. 남이 쓴 글을 온종일 반복해서 읽는 일은 차라리 쉬웠다. 정말로 힘이 들었던 건 뒤가 구리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척 웃고, 말 같지도 않은 소문에 어중간한 맞장구와 함께 어물쩡 넘기고,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었다.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일마저 지쳤다. 목이 쉬도록 이야기해가며 설득하고 같은 문장을 읽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지겨웠다.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떠나 한 달 정도 잠적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다. 손가락 하나 놀리는 게 힘들었다. 연락에 답장은 커녕, 퇴근과 동시에 휴대폰을 던져놓고 침대에 엎어지는 날들이 잦아졌다. 평범함에 감사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질려갔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깎아내서 견디는 일 같았다.
그래, 여기까지는 내 잘못이 맞다. …돌이켜보니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일이 힘들다고 징징대는 나를 위로해주던 과거의 너를 생각하면 얼핏 후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너는 너무 ‘갑자기’ 이별을 고했다! 불만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불안하게 했다면 짧게나마 언질이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끝내기를 선택했다. 내 입장에선 가만히 있다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다. …쓰레기 같은 짓을 했으니 ‘가만히 있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제일 필요로 할 때 내가 제일 사랑했던 너는 나를 떠나길 택했다.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얄짤없어서 너와 헤어진 뒤에도 일상은 잘만 굴러갔다. 여전히 일은 쌓여 있었고, 재수없는 놈들은 뒤에서 호박씨 까기를 즐겼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죽도록 일만 했다. 사실 연애도 했다. …S를 닮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래도 무료함은 여전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이벤트를 바란 적은 없는데. …빌어먹을, 팀장 말 좀 잘 들을걸. 바짓단에 땀이 배인 손을 꾹 쥐며 생각했고, 다음으론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게, 팀장은 왜 그렇게 말를 길게 해서는!
무슨 상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사이에 시답잖은 잡담이 섞이는 바람에 대충 넘긴 게 화근이었다. 조금만 주의깊게 들었다면, 전날 술을 마시지 않아서 판단력이 흐리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는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이 꼭 자연재해처럼 느껴졌다. 피할 수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왔다.
마주친 눈의 온도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다.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야. 마음을 침착하게 다스리려고 애써도 심장은 눈치없이 쿵쿵 뛰었다. 당연히 설렘 같은 감정은 아니었다.
“…네, H입니다.”
머리 어디가 고장난 것처럼 삐걱댔다. 드는 생각은 딱 하나. S다. 정말 S다. 지금까지 거쳐온 수많은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S. 줄었을 리 없으니 당연하지만 키는 여전히 컸고, 그 사이에 조금 마른 듯 보였다. 뻗어온 손을 맞잡으며 가볍게 악수했다. 역시나, 살이 조금 내린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는데. 뭐 어쩌게.
“작가님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제가 작가님 전담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간단하고 형식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정신은 빠져 있는 게 느껴졌다. 잠깐 마주쳤던 눈은 다시 마주볼 자신이 없어 그냥 그 근처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일단은 제가 배정되긴 했는데… 저희 측에서도 작가님께서 담당자 변경을 원하신 이유를 알아두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서로 곤란한 게 사실이니까…….”
다음 말은 조금 망설였다.
“또… 담당자 재변경 요청하시면 제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말과 함께 작은 한숨이 나왔다. 착잡함이나 피로보다는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여전히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어려웠지만. -
519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3:29:29>>518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너는 내게 관심을 주는 일이 날이 갈수록 드물어져 갔다. 하물며 말 못하는 식물마저도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네가 살려냈던 내 마음은 너에게 방치되어 죽었다. 이십 년이 넘는 세월을 죽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그것은 당연하게도 다시 죽었다. 모든 기적은 당연한 결말을 맞이하더라.
같은 같지않은 변명 나부랭이로 더 이상 너와 내 관계를 포장하거나 내 얼굴에 금칠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나약하게 무너졌다. 결말을 맺은 이야기에 쓰잘데없는 후일담같은 것을 다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담당자가 없어진 작가다. 너는 은둔 괴짜 작가를 떠맡게 된 불운한 담당자고. 그뿐이다. 조금만 덜 비밀스럽게 연애했더라면, 우리가 언젠가 서로 사랑했었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서 배려심을 발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바보같은 만약의 이야기 따위는 되새길 필요 없는 그런 관계다. 나는 다리를 꼬면서, 손짓으로 종업원을 불렀다.
"날씨 더운데, 뭐라도 좀 마시죠. 제가 살 테니-"
주문서를 적다가, 나는 흠칫했다. 너한테 뭘 마실지 묻지도 않고, 네가 가장 즐겨마시는 그 음료를 자연스럽게 적어버렸으니까. 껍질에 남은 흉물스런 꿰맨 자국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이었다. 네게만 익숙해져 있었던 내 버릇. 나는 그 아래에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 룽고를 써내리고는, 먼저 써버리고 만 그 음료에 두 줄을 직직 그으며 너에게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마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소름끼치는 초록색 눈동자로 쏘아보다시피 하고 있는 S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하고 평이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 입가에 서린 흐릿한 미소와 함께 서려 있었던 자상함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왠지 이야기하는 상대를 깔아보는 것 같은 독선적인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얼굴 반쪽에 남은 상처에서 빚어진 강박적인 방어기제가, 당신과 함께 있었을 때는 당신의 따뜻함에 수그러들다 어느덧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 방어기제가 새롭게 날을 벼리고 되살아나 있었다. 당신의 말에 S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됐나요? 당신의 전임자가 출간도 되지 않은 원고를 유출했어요. 해고에 더불어 배임으로 고소까지 당했을 텐데. 뭐 담당자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새 담당자님을 모셔야겠죠. 그뿐입니다."
그 담당자가 너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글쎄, 어떨까. 끝난 인간관계에 구질구질한 속편이 필요할까. 아니, 나는 그런 이른바 '뇌절' 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에 도사리고 앉은 S는 당신에게 잔인하기까지 한 선고를 내려버리고 말았다.
"아직까지, 새로운 담당자님께는 그 어떤 문제점이나 결격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자연스러운 트집을 잡아서 담당자를 다시 배정받는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짓거리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소리다. 이건 미련 같은 게 아니다. 내 개떡같은 자존심이다. 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정상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나는 정상이야. 맞지?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520 이름 없음 (5487224E+5) 2020. 7. 4. 오전 3:35:35>>519 답레가 궁금해서 계속 버텼는데 제가 레스를 쓸 정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ㅠㅠㅠㅠㅠㅠ 괜찮으시다면 내일 이어두겠습니다!
-
521 이름 없음 (7457599E+5) 2020. 7. 4. 오전 3:37:49>>520 #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질질 끌어서 죄송합니다 88 모쪼록 푹 쉬어주세요. 다음 번에는 굳이 답레 기다리지 말고 쉬러 가셔도 좋으니까요. 좋으실 때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22 이름 없음 (6668601E+5) 2020. 7. 4. 오전 5:14:11하늘에는 노을이 져 있었다. 그 하늘은 시간의 흐름에 얽메이지 않고 얼마간 노을이 떠 있다가 한낮이 되기도 했고, 갑작스레 밤이 되기도 했다. 그걸 두고 마땅히 부를 말이 없었던 사람들은 멸망이 왔다고 말했다.
오늘은 4월의 중순, 시린 한파가 불어닥치는 한겨울의 중심이다.
나는 그런 와중에도 학교에 가기 위해 최대한 옷을 두껍게 껴 입었다. 세상이 끝나는 동안 바보로 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노을이 찬란하게 지고 있었다.
나는 익숙한 솜씨로 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창문 너머로 커텐이 쳐진 네 방을 올려다 보면서. 이 빌어먹을 멸망 덕분에 가로등은 항시 켜져 있었기에 나는 꼭 밤 늦은 시각 연인을 기다리는 듯한 꼴이 되었다.
나는 재촉하듯이 초인종을 한번 더 눌렀다. 야, 학교 안 가냐. -
523 이름 없음 (7385592E+5) 2020. 7. 4. 오후 4:02:00>>522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시계를 거의 때리다시피 내리쳐 껐다. 방 안을 떠도는 아침의 찬 기운에 두꺼운 이불 안으로 파고들었다. 번데기에 가까운 상태가 된 채로 팔을 뻗어 커튼을 살짝 걷어 보았다. 오늘 아침은... 음, 노을인가.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세상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찬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 너머로 아득히 들려 오는 초인종 소리에 끙,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흘리며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잠기운이 덕지덕지 묻은 눈에 비친 시각은 오전 일곱 시였다. 원래대로라면 늦잠을 잔 뒤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대충 입에 문 채 집을 나설 시각이었다. 물론 이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더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잔소리를 할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알람시계가 울리지 않는 일은 없었지만.
바보같아. 속으로 되뇌이며 네게 전화를 걸었다. 어른들도 그만둔 잔소리를 꿋꿋이 매일마다 하는 너에게. 이 모든 과정은 멸망이 시작된 뒤 매일 아침의 새로운 일과로 자리잡았다. 너는 초인종을 누르고, 나는 전화를 걸고.
"그냥 들어와..."
어차피 번호 알잖아, 라고 웅얼거린 건 덤이었다. -
524 이름 없음 (5421168E+5) 2020. 7. 5. 오전 2:21:30>>519
꼬인 실을 푸는 일에는 약간의 인내심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 좋은 머리나 손재주가 더 빨리 풀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단 소리다. 하지만 꼬인 게 관계라면 말이 다르다. 그냥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알아서 풀리지 않는다. 한쪽이 풀기 위해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도 모른다. 풀어본 적 없으니까. 가위를 들고 앉은 사람들을 방관하는 게 내 역할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덕에 관계들은 잘만 잘려나갔다.
S와도 비슷하게 끊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꼬인 연장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커튼콜도 없이 끝난 연극인데. 애써 지워진 글자에서 눈을 돌렸다. 별 거 아닌 행동으로 생각하는 편이 나았다. 해가 바뀌고도 익숙한 이전 해의 숫자를 적는 것처럼, 그냥 지우고 바꾸면 그만인 일.
“…아,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
지워진 글자와 다른 말을 뱉었다. 실은 음료고 뭐고 다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인정할 때가 왔다. S는 여전히 내 취약한 면을 건드렸다. 어쩌면 취약한 면 그 자체거나. 닮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면서 이별의 과정은 간소해지고 슬픔은 무뎌졌다. 길어지는 건 이별을 핑계 삼아 갖는 술자리의 시간과 그에 따라오는 숙취 정도가 전부였다. 그동안의 연애의 시작은 가벼웠고 끝도 그만큼 가벼웠다는 소리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미치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죽도록 슬프지도 않았다. 끝에는 거의 아무렇지도 않았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벌 받고 있나, 지금?
일단 헤어졌다는 핑계로 일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얼렁뚱땅 일을 넘겨 받게 됐을 때부터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회사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일단 이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행히 당황한 기색은 드러내지 않았다. 깔끔하게 잘 포장된 말을 내미는 일에 문제는 없었다. 늘어난 게 처세술뿐이라는 사실에 조금 슬퍼진 것만 빼면.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왜? 대체 왜? 너는 나를 계속 보고 싶니? 진심으로?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해보는 건 어때? 비슷한 결의 질문이 칠십 개쯤 떠오른 것 같다. 그중에 할 수 있는 말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에 혀를 깨물고 싶어졌다.
“네…….”
이유를 묻지도 못하는 나는 혀를 깨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뛰쳐나가고 싶어졌다. 근데 뛰쳐나갈 수도 없다. 지금 이 자리에 개인적인 일이 끼어들 자리는 없으니까.
“그럼 일단… 새 원고 얘기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소재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신다는 이야기까지는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비어있는 꼴을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남은 걸 일로 꽉꽉 채우는 수밖엔 없다. 내가 제일 잘 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
525 이름 없음 (062603E+52) 2020. 7. 5. 오전 3:49:42>>524
사랑에서 비극이 초래되는 순간은 서로가 품고 서로에게 건네어주고 서로에게 바라는 사랑이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랑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형태마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제곱으로 복잡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알맞게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너와 나 사이에서도, 우리 둘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조금씩의 차이가 어긋난 틈을 만들고 있었었지. 서로 딱 맞는 듯했던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조금의 어긋난 틈에서부터 흔들대고 삐걱거렸었고. 나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
넌 이별 이후를 어떻게 보냈지? 나보다 훨씬 너와 잘 맞는, 나보다 훨씬 너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았을까? 네 마음의 깨어져나간 자국은 충분히 마모되고 무뎌졌을까? 그것들이 너를 더 이상 콕콕 찔러 괴롭히거나 하진 않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난 내가 그냥 조금 얼굴 마주하기 껄끄러운 부끄러운 추억, 그 정도로 끝이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가슴 한복판이 네 모양으로 깨어져있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모양으로 깨어져있을 구차한 인간인 나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안도하고 안식하고 내 스스로에 잠겨 편히 익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걸 직접 물어보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정도만큼은 나는 너에게서 사랑을 배웠다고 자신한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당신과 S는 사뭇 달랐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전전하며 또다른 마음 기댈 곳을 찾았으나, 그러지 못한 끝에 결국 마음이 무뎌지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던 파편들도 둥그스름하게 갈려나가 있었다. 그렇지만 S는- 당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법을 모르는, 이 자존심의 벽 뒤에 숨은 수줍음 많은 안타까운 멍청이는, 낫지도 않고 덧나버린 상처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부러져 어긋난 채로 굳어버린 뼈처럼.
그렇다고 -혹시나, 만약의 이야기지만- 당신이 S를 동정하거나 그를 치료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S가 이런 몰골이 되어있는 것은 순전히 S가 멍청할 정도로 외골수인 탓이다.
당신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입에 올릴 때는 S의 눈매가 약간 치떠지더니 조금 가늘어졌다. S의 눈동자는 사시사철 독기어려 거만한 빛만을 띄고 있을지언정, 눈매는 감정기복에 퍽 솔직한 편이었다. 그러나 S는 이내 군말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서에 적어서는 그것을 종업원에게 되돌려주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미 끝난 사건은 잊어버리도록 하죠."
잊는다라. 웃기네. 내가 잊어버리도록 하자는 말을 입에 담은 시점에서 넌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돼. 잊는 것... 그거야말로 내가 제일 서툰 거잖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덤벙덤벙 까먹는 주제에, 잊어주었으면 하는 것은 언제까지고 담아두는 옹졸한 인간이 나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누출된 이야기를 잊고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은 다른 전개를 구상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내 뇌는, 깨어져버린 심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로 매끄럽고 차갑게 잘 굴러간다. 고맙게도.
"그 5부작의 1부에서 4부를 쓰는 동안은 어린 아이들이 차차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써왔으니까, 그 시리즈를 접어두는 동안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아이들의 감정선을 시뮬레이션해볼 겸 로맨스를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색깔을 벗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S가 자기 색깔을 벗지 않겠다는 말은, 글의 전개가 지금까지 써온 글과 같이 상당히 암담하고 우울하리라는 예고였다. 그렇다고 S가 '읽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글이야말로 좋은 글' 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오히려 그는 그 말을 대놓고 비웃었다), 온 세상의 불행이 그의 몫인 것마냥 불행한 삶을 살아온 그는 그 누구보다도 현대인의 불행과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글에 녹여냈다. 그리고 불행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뒷내용 없는 한 줌의 모호한 희망을 작중 등장인물들에게 던져주기를 즐겼다. 그것이 읽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하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평이었고, 그의 글이 인기있는 이유였다.
그 동안 그의 글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농락한 벌을, 그는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일까. -
526 이름 없음 (062603E+52) 2020. 7. 5. 오전 3:51:07# 와주셨네요! 실례되는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놀랐습니다. 얘가 이런 인간군상이라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 얘가 참치님을 너무 힘들게 한다면 당근으로 저참치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
527 이름 없음 (7735562E+5) 2020. 7. 5. 오후 6:42:33>>525
삶은 얄궂다.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보란 듯이 내던지면서 설마설마 하던 일은 정말로 일어나게 만든다. 가끔은 존재조차 까먹어서 설마하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던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내게 S는 어떤 쪽일까? 헤어진 뒤로 S에 대해선 어떤 예감도 들지 않았고, 잊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닮은 사람만 골라 만났다고 하니 어딘가에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더 소름끼치는 건 그게 무의식이 한 일이라는 것이다. Y가 말해준 순간에도 코웃음 쳤고, 뒤늦게 혼자 생각해본 후에야 깨달았을 정도니 말 다 했지, 뭐.
깨달음의 순간에 몰아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생에 그보다 큰 자극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연애를 하지 않겠다 다짐해놓고선, 또 어딘가 S를 닮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굴고 고백의 타이밍을 예견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Y에게 대차게 욕을 먹고…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초연해졌나 하는 생각도 했다. 전부 착각이고 내 소망이었다. 그냥 그 일들이 내 어느 면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어떤 일보다 자극적이었다. 심지어 눈물을 짜게 하는 매운맛이나 코를 막게 하는 아린맛 하나로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자극이었다. 살려줘. 아니, 차라리 죽여줘……. 무신경한 방관자는 어디 가고 개복치 하나만 남았다. 작은 표정변화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신경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걸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신경쓰지 않기는 실패했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일단 유출 건을 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에는 안도했다. 속에선 폭탄이 터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웃겼다. …아니, 안 웃겨. 지금 나는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는 와중에 지뢰를 밟은 기분이라고. 붙박이처럼 서 있든, 도망치기 위해 발을 떼든 똑같이 죽는 결말인. 그리고 이 정신없는 와중에 폭탄이 하나 더 터졌다.
“로맨스요…….”
울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이 나지는 않지만. 머리에선 사이렌이 요란하게도 울려댔다. 나도 아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었다. 나는 도저히 S의 글을 읽을 자신이 없다. 게다가 로맨스라고? 벌써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며 일희일비하는 꼴이 보였다. 등장인물이 나랑 머리모양이라도 비슷했다가는 하루종일 예전 일을 곱씹다 적어도 삼 일은 밤을 지새울 게 뻔했다. 나는 계속 영원히 알 수 없는 S의 속내를 짐작 비슷한 거라도 해보려고 애쓸 테고, 그래봤자 알 길은 없으니 역시 결말은 앞의 지뢰 상황과 같다.
결격사유가 없어서 담당자로 계속 쓰겠다고 했었지. 그럼 사유를 하나 만들어보는 건… 하는 나사 빠진 생각은 타이밍 좋게 음료가 나오면서 끊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통째로 들고 한 번에 마신 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빨대를 물고 두 모금 정도 마시기만 했다. 컵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작가님께서 로맨스를 쓰실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독자들 기대도 크겠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나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심지어 일생일대의 고민까지 시작됐다. 로맨스라는 세 글자가 머리를 터뜨린 것과는 별개로,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로맨스 장르에는 비교적 미숙한 편집자였다. 신작에 주목이 쏠릴 텐데, 로맨스를 처음 다루시는 만큼 그쪽에 경험이 더 많은 좋은 편집자를 추천하는 식으로……. 아주 완벽한 탈출 계획이었다.
문제는 또 나였다. S가 이 회사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심지어 로맨스를 쓴다는 걸 알고, 게다가 내가 추천해준 편집자와 일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괜히 질척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같이 일하면서 헛소리를 지껄이지 않을 자신은 있니? 여기에도 대답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왜……”
나를 그대로 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생각만 했는데.
“…로맨스를 고르셨을까 궁금해서요. 색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지만, 이전에 주요하게 다루신 적은 없던 소재로 알고 있는데.”
대답해주시면 나중에 홍보팀으로 넘겨서 정식 출간 이전에 어쩌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편집자로 할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나한테는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라는 걸 들키지만 않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528 이름 없음 (7735562E+5) 2020. 7. 5. 오후 6:45:52>>526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저한테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속도가 느려서 계속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혹시 참치님도 어려운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529 이름 없음 (9707083E+5) 2020. 7. 5. 오후 8:45:24>>527
S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다가 소리없이 몇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제 기준에서나 로맨스지, 독자들이 읽기에는 그저 평소의 제 작품과는 달리 주인공이랄 만한 인물 두어 명에게 포커스가 꾸준히 맞춰지는 다른 작품에 불과할 겁니다."
그의 글은 거의 피카레스크-군상극의 구성을 띄고 있었다. 특별한 주인공과 그 주변인물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나 줄거리도 세 명에서부터 많게는 십수 명까지의 제각기 다른 인물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담담하고 건조하게 서술해나가는 스타일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양날의 검 같은 특징으로,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산만하다고 질색할 만한 타입이었지만 그는 줄거리의 말도 안 되는 촘촘한 짜임새로 그것을 만회했고, 그 짜임새에 빠져 그의 팬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군상극 형의 구성을 내려놓고 소수의 등장인물에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에게 있어선 신선한 도전이었다.
"전임자는 제가 로맨스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땐 별 말 없었는데 이번 담당자님께선 세심하시네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주시고."
나는 너를 떠나면서 너는 역시나 내게는 과분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더 네게 어울릴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너를 원망하며 떠날지언정 결국에는 네가 좀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패배자의 핑계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를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이기도 했다. 나는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길 빌었다. 나 같은 되다 만 반편이에게 잠시나마 천국을 엿보여준 너라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거니, 나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그렇게 휘청거리고 뒤흔들리고 있는 건데. 내가 무슨 소설을 쓰겠다는 말 한 마디에 왜 그렇게 동요하면서 되묻는 건데. 내가 뭐라고. 너한테 난 일보다 가치없는 그저 그런 지나가는 애완동물 1이 아니었냐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차라리 네가 보란 듯이 뻔뻔하게 행복한 것 같아 보였더라면, 나는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같지 않은 패배자의 위안 한 줌이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그 구질구질한 위안 한 쪼가리라도 내게 주긴 아깝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중요한 질문이라면 대답해드리죠. 하나의 시점을 깊게 묘사하는 글이 써보고 싶어서 오소독스한 구성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알맞은 지향점이 로맨스라고 생각했구요, 대답이 됐습니까?"
S는 얇은 테의 안경을 슬며시 벗어내리고, 손을 들어서는 엄지손가락을 뺀 네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한쪽 관자놀이를 슬며시 짚었다. 당신도 익히 아는 S의 버릇이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심경이 복잡해지거나 해서 생각할 게 많아지면 그는 항상 저 제스쳐를 무의식적으로 취했다. 언젠가 당신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던가, 너 항상 이러잖아- 하면서 그의 흉내를 냈을 때 아, 내가 진짜 그래? 하고 되물으면서 그는 실없이 웃었었더랬다. 그는 한때는 그렇게 웃을 줄도 알았더랬다. 지금 그의 얼굴 위에 놓인 것은 대리석 조각상 같은 싸늘한 무표정뿐이지만. -
530 이름 없음 (1225079E+5) 2020. 7. 5. 오후 11:53:15여자는 좁은 집에 살았다. 여섯 채의 방이 한 층에 다닥다닥 붙은 낡은 아파트였다. 개 중에서도 여자의 방은 특히나 햇볕이 잘 들지 않았다. 늘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아도 늘 그늘이 졌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작디 작은 발코니. 그것이 전부였다. 힘을 주면 부서질 듯한 난간 하나가 달린 낡은 발코니. 건조대도, 잡다한 화분도 놓을 자리가 없는 그 발코니를 여자는 무척이나 사랑했다. 여자는 저녁마다 발코니로 나와 난간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고, 아침마다 난간 위로 턱을 괸 채 바깥을 구경했다. 낡은 아파트가 질서 없이 늘어진 동네 바닥에 구경할 게 무어 있었겠냐만, 하여튼간 그렇게라도 아침의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그녀의 낙이라면 낙이었을 것이다.
" 너는 네 삶이 좋니? "
탁한 담배 연기가 여름 바람을 따라 흔들렸다. 더운 여름의 초저녁, 느긋하게 떠내려가는 노을을 등지며 내뱉은 말이었다. 여자가 난간에 기댄 몸을 돌려 노을을 바라보았다. 입술 사이를 비집은 담배의 끝자락은 지고 있는 노을처럼 반짝였고, 희미한 연기가 쉴 틈 없이 피어올랐다. 여자는 자신의 물음을 마지막으로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던진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 내가 미쳤지. 이런 곳에서 사는 인생이 뭐가 좋겠어? "
여자가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여자가 살며시 고개를 틀자 마침 저물어가던 노을과 엇갈려 그녀의 눈과, 코와, 입술 위로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여자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고 있었다.
" 아무튼. 나는 모르겠는데, 너는 빨리 여기서 도망쳐.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뭐 때문에 이 구렁텅이까지 끌려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뭐, 돈 때문이겠지. 빨리 볼 일 다 보고 나가. 오래 있으면 있을 수록 도망치기 더 힘들어지니까. "
여자가 웃었다. 입술 사이를 비집던 담배는 어느샌가 발코니 바닥에 떨어져 슬리퍼 밑창에 짓눌려버린지 오래였다. 가라앉던 노을의 빛도, 타오르던 담배의 빛도 모두 꺼졌다. 찬찬히 드리우는 어둠이 서늘한 공기를 몰고오리 시작했다.
" 후회한다? "
여자가 고개를 까딱였다. 하나로 느슨하게 묶어내린 머리칼이 고갯짓을 따라 찰랑인다. 여자의 시선은 당신의 눈동자 그 안에 머물러있다.
#느와르! 약간 구룡성채같은 범죄 도시 느낌이야~ 어떻게 이어주던 상관 X!! -
531 이름 없음 (5829723E+5) 2020. 7. 6. 오전 1:37:57>>530 오늘은 일터에서도 별일 없었고, 큰맘 먹고 들른 코인 빨래방에서도 일전의 깡패같은 놈은 커녕, 운좋게도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아 행복하게 귀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지만 노을이 지는 모습은 나름 운치있죠. 노을이 멋지다고 해서 하루하루 목숨걸고 살아내는 생활이 안 지겨운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집으로 가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말이 걸린 것 같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피는 여자분이 이 쪽을 보고 있더라구요. 멀어서인지, 이 도시에 항상 깔려있는 소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눈을 찡그리니 웃는 표정이나 이 쪽을 향한 시선 정도는 보였지만... 목소리는 닿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손에 든 비닐봉지가 손을 아프게 파고들어와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가 든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또랑또랑 여자분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말 거신 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저한테 말 거신 거면!! 여기서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요!!"
이만하면 들렸겠지. 싶을 정도의 음량으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발코니에 선 여자분께 말을 건네고, 고개를 꾸벅 숙여보인 뒤, 다시 봉지를 집어들고 힘차게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동네에 온 지는 꽤 됐지만 발코니에서 말을 걸려보긴 처음이었습니다. 하긴 흉흉한 동네같아도 나름 인정 많은 분들도 계신 동네긴 하죠. 수퍼마켓에서 잠깐 뵈었던 그 아저씨처럼요. 그래도 역시 이 동네 무서우니까 돈만 모으면 안전한 곳으로 갈 거지만요. 긴 하루였네요. 배고프니 집에 가서 냉동피자라도 데워먹어야겠습니다. -
532 이름 없음 (3018086E+5) 2020. 7. 6. 오전 2:09:45>>531
" 어머. "
여자가 축 늘어지듯 난간에 매달려 몸을 기울였다. 여자의 집은 5층이었다. 사람의 머리 하나가 까마득히 보일 높이에서, 여자는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따박따박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모습이 퍽 재밌었던 모양이다. 머리칼 끄트머리를 간신히 붙잡은 머리끈이 밤바람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흔들린다. 여자는 그에도 아랑곳 않고, 땅바닥을 향해 더욱이 몸을 기울이며 손을 흔들대었다.
" 아마도 너한테 한 말이 맞을거야~ "
여자가 왼손으로 난간을 쥐었다. 발끝으로 바닥에 선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꼭 곡예를 하는듯 대담하다.
" 어디 살아? "
여자가 아까보다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생글대는 얼굴은 여전했다. 별 거지같은 동네에서 또 처음 만나는 캐릭터라. 여자의 눈썹이 작게 움찔였다. 부드럽게 말려올라간 입꼬리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작은 발코니용 슬리퍼를 의미 없이 질질 끌어대던 여자가 난간을 쥔 왼손 위로 엎어지듯 몸을 기울였다. 여린 몸선을 가린 가디건의 소매가 더러워졌을 게 분명했다.
" 나랑 친구할래? "
여자가 다시 한 번 외쳤다. 여자의 옆집에 사는 노파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했다. 그러니 이쯤이면 생전 처음 듣는 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들길 때도 되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전개일줄은 몰랐어~~...!! -
533 이름 없음 (5829723E+5) 2020. 7. 6. 오전 10:44:29>>532
냉동 피자는 잘만 데우고 이런저런 재료를 첨가하면 맛있죠. 아니, 그럴 여유따위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이 아프고 짐이 무겁고 배가 고프거든요. 이 와중에, 아까 그 여자분인 듯 했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만, 뭐래는 거야.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사는 곳을 물은 건가요? 이 동네에서요? 저는 표정관리를 못하니까 질겁한 티가 한가득 나는 표정으로 돌아봤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제 어이를 저 하늘 너머 안드로메다로 탈주시키네요. 친구라고요? 언제 봤다고요? 무엇보다도 초면에 사는 곳을 묻다니,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위험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이상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보입니다. 도망가야겠어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뒤돌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웬 할머니가 시끄럽다던가 화내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냥 대꾸를 안할 걸 그랬어요. 일부러 집과는 먼 골목으로 빠졌다가 돌아서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역시 이 동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귀한 기회로 인류애를 회복했는데, 인류애고 뭐고 이곳 인간들 대부분은 무섭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하자는 말은 전면취소입니다. 앞으로 출퇴근길은 다른 길목을 찾아야겠어요. -
534 이름 없음 (5829723E+5) 2020. 7. 6. 오전 10:45:14손에 든 봉투를 ->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
535 이름 없음 (0439182E+5) 2020. 7. 7. 오전 12:29:02>>529
날 사랑하긴 했니? 헤어질 때는 늘상 이런 질문을 받았다. 나는 언제나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도대체 저런 건 왜 물을까, 하는 뺨 맞을 법한 생각을 했다. 다행히 생각에 그친 덕분에 정말로 맞은 적은 없다. 늘 차이긴 했지만. 그런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질문을 이젠 내가 하고 싶어졌다. 당장이라도 S에게 묻고 싶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있어?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관계는 이렇다. 나는 쏟아내고 너는 받아준다. 처음에는 그게 특별한 울타리처럼 여겨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하고 튼튼한 ‘내’ 울타리.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게 내가 아니라 너를 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타리를 앞에 두고 마주볼 수야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닿을 일은 영영 없을 것이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난 정말로 바쁘기도 했다. 마음 한쪽은 늘 깨져있는 것 같은데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일을 하고……. 종종 듣는 피곤해보인다는 말에 가볍게 웃으며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은연 중에 슬슬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늘어가는 동시에 아주 오래 자는 날도 있었다. 꿈은 뒤죽박죽에 몇 시간을 자든 피곤했다. 그쯤 되니 위로가 되는 게 없었다. 돈을 써 봤자 즐거움은 길어봐야 하루이틀이고, 가족이나 친구도 대하기 어려웠다. 천천히 퇴색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깨닫는 순간과 동시에 미뤄두었던 불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견고한 울타리는 사실은 네 것이었고, 사실은 울타리라 생각했던 게 벽이었고……. 나쁜 생각은 몸집을 쉽게 불려갔다. 뭐라도 묻고 싶었다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물어서 대답을 듣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가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만 한 모금 마셨다. 전임자의 실수나 첫 작업이라는 핑계로 더 신경쓰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쉽게 나오진 않았다. 특히나 S와 내 사이에 처음이라는 단어를 놓을 자신은 정말로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건 이후 홍보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빈 자리를 일로 채워넣겠다고? 그게 제일 잘 하는 일이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다. 내가 채워넣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비어있는 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신경만 쓰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 흔들리며 휘청댈 거다. 그러면서도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쓰겠지.
“오늘은 수정하신 작품의 대략적인 구성이나 방향성 정도만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나중에는 메일로 원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쪽으로 연락 주세요.”
뒤늦게 가방을 뒤적여 명함을 건넸다. 내 속이 어떻든 지금은 딱 이 정도 거리에 불과했다. 익숙한 네 버릇을 따라하며 웃을 수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을 수도 없다. 당연한 일이다. -
536 이름 없음 (3084012E+5) 2020. 7. 9. 오전 1:03:03>>523
전화를 받은 채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절로 새어나왔다. 네 부쩍 길어진 잠은 멸망이 시작되고부터 누구도 나무라질 않아, 점점 뻔뻔스러워지던 탓이다. 그는 문을 열고 이미 익을대로 익은 너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그 녀석 안에 있죠?"
데리러 왔습니다 란 말은 구태여 하지 않았으나 볼일을 묻는 목소리도 없었다. 이 오래된 일은 습관처럼 정해져 있었기에 누구도 군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너의 이불을 들추고 물었다.
"일어났지? 어서 나가자."
//너무 늦어서... 안 이어줄 것 같지만 올린다ㅠㅠ -
537 이름 없음 (3688728E+5) 2020. 7. 9. 오전 1:17:06>>536
"...너 먼저 가."
들춰진 이불 틈새로 찬 기운이 들어와 몸을 웅크렸다. 꾸물거리며 침대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작게 웅얼거렸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가 먼저 가는 일은 없겠지. 곧 내 짧다면 짧은 잠투정은 끝이 날 테고, 나는 졸음이 덕지덕지 묻은 눈으로 너를 따라나설 것이다. 그리고 석양의 아래에서 등교를 하겠지.
"학교같은 건 이제 안 가도 되잖아."
지금 학교에 간다고 해도 반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열 명 정도만 있어도 기적이지. 애초에 선생들도 안 나오는 자들이 태반인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와선 입시고 뭐고 전부 소용없잖아. 궁시렁대는 소리는 입 안에서 소용돌이치다 사라졌다. 대신, 그 모든 감정을 응축해 다시 한번 으음, 하고 정체모를 신음을 내뱉을 뿐이었다.
/유감! 있었지롱! :D -
538 이름 없음 (9213078E+6) 2020. 7. 9. 오전 9:41:43>>537
"또 시작이냐.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네 익숙한 잠투정에 그는 곤란하다는 듯이 눈썹을 찌푸렸음에도 네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조리있지 않다는 정도는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면 일상 조차도 쉽사리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해서.
"그렇다고 잠만 잘 수는 없잖아. 너 마땅히 할 일도 없는거 알아."
이유도 없이 너를 재촉하면서 그는 냉기가 묻어난 손으로 네 어깨를 토닥였다. 이불 속에서 뭉쳐져 있던 온기가 너를 통해 손으로 전해졌다. 커튼 바깥의 빛은 여전히 저녁의 빛 처럼 미미해서 너를 괴롭히는 건 사소한 냉기에 지나지 않는 듯 싶었다.
//(((폭풍눈물)))808ㅠㅠㅠㅠㅠㅠㅠ근데 또 늦어서 미안타... -
539 이름 없음 (3688728E+5) 2020. 7. 9. 오후 4:41:39>>538
저렇게 정곡을 찌르다니. 할 일이 없는 건 사실이었다.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해봤자 딱히 재미있지도 않았으니까. 불만으로 입이 댓 발은 튀어나온 채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다. 씻는다는 말도 없이 갈아입을 옷을 챙겨 비척비척 욕실로 걸어 들어간 건 약간의 심술이었다. 할 일이 없는 건 맞지만, 그게 아침잠을 방해받을 이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 샤워기를 틀고 머리에 냅다 찬물을 끼얹자 졸음이 조금은 가셨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며 교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이것도 웃기지, 더이상 교문에서 학생들을 잡을 교사도 선도부도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손은 익숙하게 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학교를 갈 때는 교복을 입는다. 몇 년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힌 이 법칙은 세상의 종말이 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성공했네, 학교도.
"가자."
말과는 다르게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가 이불을 적시는 게 느껴졌다. 이런, 나중에 잔소리 듣겠네. 태평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손을 얄밉게 살랑살랑 흔들어 보인 데는, 조금쯤 널 약올리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나도 늦었는데 뭐^0^ -
540 이름 없음 (8831563E+6) 2020. 7. 9. 오후 9:25:10"시안?"
마른 입술을 가르고 나온 목소리는 꽤나 건조했다. 오랜 시간 물로 목을 축이지 못해 엉망으로 갈라진 입가는 옅은 핏물이 베어있었다. 두 손목을 벽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쇠사슬이 찰그락 거리는 소리가 공허한 감옥 안을 메웠다.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거야?"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까지 무릎걸음으로 기어온 이는 뜻 밖에도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마도 피와 먼지로 지저분한 붕대가 눈가를 감싸고 있지만 않았다면 기쁨에 달아오른 녹안을 마주할 수 있을 터였다.
남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차가운 창살에 이마를 부딪힌 후에야, 지독한 구타로 붉게 부은 뺨을 창살에 살짝 기댈 수 있었다.
"괜찮아, 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네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윽고 남자는 누군가를 달래듯 부드러운 어조로 속삭였다. 그는 침묵의 대가로 양 눈의 시력을 잃었으나 조금의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의 부상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고, 남자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을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 시안. 혹시 내게 실망했어?"
이번엔 좀처럼 쓰다듬어 주지 않네. 남자가 작게 중얼거린 것은 곧 사형될 이에게서 나온 투정이라기엔 우스운 내용이었다.
// 맛있는 클리셰,,,
친구에게 배신 당한 줄도 모르고 대신 귀족 살인의 죗값을 치른 호구 평민남(적발/녹안)이 배신한 친구가 온 줄 알고 실컷 낑낑대는데 사실은 딴 사람인 상황 맛있지 않나,,,?
-
541 이름 없음 (8370531E+5) 2020. 7. 9. 오후 10:06:35>>540 고향을 떠나와 어느 귀족 나리 댁의 지하감옥의 간수가 된 지 어느덧 한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지하감옥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얼마간 나와 몇 안되는 동료들밖에 없었던 이 곳에 손님이 찾아왔다. 아니, 죄수라고 해야 할까? 듣자 하니 이 집의 영애 되시는 분을 살해했다는 모양이다. 그래서 배후를 캐내려고 온갖 고문을 다하더라. 건실하게 생겨서는 사람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높은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런거지, 뭐. 어쨌든 배후를 캐내기 위해서라도 살려두기로 했는지, 죄수에게 식사를 주란다. 식사를 주려고 다가가니, 죄수는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어왔다. 아, 피곤해. 식사나 주고 다시 저기 서 있을래.
"뭐라는 거야? 식사다!"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안 쪽으로 들어가 식사라기도 민망한 거친 빵 덩어리와 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다닥 나왔다. 그나저나 시안이라, 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라니. 그 자가 배후인가본데? 적어도 연관은 있거나. 나중에 병사들이 오면 보고해야겠다. -
542 이름 없음 (7530493E+5) 2020. 7. 14. 오후 11:39:21장사패도 쉬이 오가지 못하는 깊은 산 속. 초목이 우거지고 비탈이 가파른 이곳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이는 잔뼈 굵은 산지기나 약초꾼, 혹은 사정이 있는 사람뿐이었다. 그는 후자에 해당했다. 버려진 암자에 눌러앉은지도 벌써 몇 년, 평생 도성 밖으로 걸음한 적 없는 몸이 자연에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도 어떠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었다.
연한 빛을 띤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이를 훑었다. 이 근방에서는 보기 힘든 군복이었다. 그러고 보니 산등성이 두 개를 넘은 곳에서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만약 이자가 그곳에서 온 것이라면 부상을 입은 채로 그 험한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 된다. 산짐승을 만나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는 짐짓 난감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혹여 적국의 군인이라면, 그 또한 오랏줄을 피하지 못할 터였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자를 데려가는 순간 제 평온한 일상은 깨어질 것이 분명했다. 조용히 약초나 캐고 밭이나 일구며 여생을 보내기로 맹세했는데. 그건, 실로 곤란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는 본디 의원이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원이 된 그가, 목숨이 위독한 이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지금은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초가 든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부상자에게 손을 뻗었다.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팔을 들어 제 어깨에 걸친 뒤 부축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손과 옷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당장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제 집으로 데려가야 할 듯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걸음을 옮겼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
543 이름 없음 (2985336E+6) 2020. 7. 15. 오전 12:39:26>>542
뺨에 닿는 흙이 차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아, 죽는구나. 탄식도 되지 못한 흐린 숨이 벌어진 입술 새로 흘러나왔다. 고작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득한 정신을 붙잡아 가며 수풀을 헤치고 산등성이를 넘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적진 한가운데를 향해 가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오직 삶에 대한 집착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이 쓰러져 있다. 어쩐지 헛웃음이 나왔다.
그 때였다. 저만치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 왔다. 주변을 맴돌던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늘어진 몸이 바짝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몸을 일으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허리춤에 매달린 총이라도 찾아 보려 하지만, 이미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손끝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 눈을 내리감았다.
이제 끝이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걸친 것도 같았다. 이어 제 몸을 일으키는 손길이 느껴진 것도 같았지만, 이미 정신은 아득히 멀어진 후였다. 의식을 잃은 몸뚱이가 무겁게 늘어진다. -
544 이름 없음 (6177543E+5) 2020. 7. 15. 오전 1:10:17>>543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이부자리를 펴고 사내를 뉘인 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이마를 훔쳤다. 휴식도 잠시, 옷을 벗기자 드러난 부상에 침음을 삼켰다. 이런 중환자를 마지막으로 받아본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으나, 동시에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었다. 과거의 빛을 되찾은 눈이 날카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혈과 소독, 그리고 봉합까지. 수술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허름한 외관과 달리 깔끔한 암자의 내부에는, 천만다행으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봉합이 끝난 상처 부위에 약초를 덧댄 붕대를 두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는 숨을 내쉬었다. 실로 오래간만에 맛보는 기묘한 고양감이었다. 진료를 볼 때마다 그는 그만의 세상에 빠지곤 했다. 그와 환자뿐인 작은 세상에.
뒷정리를 마치고 깊이 잠든 환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준 뒤 옷가지를 챙겨 바깥으로 나갔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손은 깨끗이 씻었으나, 미처 갈아입을 새가 없었던 옷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다. 출혈이 심했으니 앞으로 한동안은 깨어나지 못할 터였다. 그 김에 옷도 빨고, 겸사겸사 물까지 떠올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암자를 흘긋 돌아본 뒤 근처의 냇가로 향했다. -
545 이름 없음 (2985336E+6) 2020. 7. 15. 오전 10:07:34>>544
그는 꿈을 꾸었다. 고향과 가족들과, 여타 '행복한' 기억을 조명하던 것은 이내 성질을 바꾸어 폭격과 피와 비명소리만이 낭자한 이 땅 위의 지옥을 비추었다. 꿈 속에서, 바로 옆을 지키던 전우가 붉은 피를 흩뿌림과 동시에 그는 눈을 떴다. 저도 모르게 몸을 반쯤 일으킨 탓에 이마에 올려져 있던 물수건이 툭 떨어졌다. 그러고 보니, 온몸에도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물수건을 쥔 채 제 환부를 살피다 뒤늦게 찾아온 고통에 풀썩 몸을 뉘였다. 앙다문 잇새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전쟁터만은 벗어난 것 같았다. 한낱 군인을, 이만한 의약품을 써 가며 살릴 위인이 전지에 존재할 리 없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망연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벽을 짚고 조심히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회복되지 않은 신체가 비명을 질렀다. 자꾸 힘이 풀리려는 다리 탓에 좁은 오두막을 가로지르는 것마저 한참이 걸렸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이 암자의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여길 떠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허나 저런 생각에 걸음을 서두른 것이 원인인지, 그는 문을 몇 걸음 앞둔 곳에서 무릎이 꺾여 와당탕 쓰러지고야 말았다.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어깨며 팔에서 아릿한 고통이 올라와 괜한 아랫입술만 짓씹는다. 버석하게 마른 얇은 살이 찢어져 피가 고였으나, 신경도 쓰지 않고 몸을 다시 일으키는 데만 집중했다. 그는 기다시피 겨우 문간에 도달해서는 문을 밀치듯이 열어냈다. 주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방향이었다. 위치도 모르는 숲 속에서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외벽에 기댄 채 허망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다 아무 곳으로나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 곳으로든 간다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올 것이다. 운이 좋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도 모르고. -
546 이름 없음 (6122038E+5) 2020. 7. 15. 오후 2:00:50>>545
냇가에서 물을 떠오는 김에 밭까지 들렀다 오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 벌써 저녁시간이 가까워 오는 탓에 식사거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채소 위주의 음식을, 환자를 위해서는 미음을 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 어디에도, 집 밖으로 나온 환자를 다시 데려오는 건 없었다.
벌써부터 정신을 차리고 돌아다닐 기력이 있다니, 여타 다른 이들보다 체력이 강인한 듯싶었다. 하기사, 그 험준한 산을 다친 몸으로 오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지만. 그새 어디서 넘어지기라도 했는지 늘어난 잔상처가 눈에 띄었다. 작게 혀를 차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사내의 팔을 붙들었다.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직 부상이 낫지 않았으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무리하게 움직인 탓에 상처가 벌어졌는지 붕대에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기껏 치료해 놨더니 이러깁니까, 정말. 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팔을 집 쪽으로 가볍게 끌어당겼다. 모양새를 보아하니 또 다시 부축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547 이름 없음 (3389396E+6) 2020. 7. 15. 오후 3:15:38>>539
이 익숙한 사이클을 지켜보며 그는 네가 욕실로 들어가는 동안 한숨을 짧게 빼었다. 결국 그렇게 할 거면서, 라는 말을 대신하듯이 말이다. 네가 욕실에서 나오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샴푸 향기가 코 끝을 자극해 절로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지런히 씻고 준비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했다. 일의 승패로 따지면 결국 네가 진 걸까 싶어져서.
네가 침대에 쓰러지기 전까지만의 이야기다.너를 보며 자연스럽게 찌푸리는 미간에 해질녘의 어스름한 햇살이 졌다. 그 불편한 심기를 아는걸까, 일부러 의도한 걸까 너는 손을 흔들며 침대에 누워 능청맞게 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침대에 앉아 네 머리로 손을 옮겼다.
그리고 딱밤을 때렸다. 작게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로 경쾌한 울림이 난 딱밤 소리에 그는 살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너를 내려다 보며 너의 어깨를 재촉하듯 흔들었다.
"꾸무럭대지 말고 일어나. 나 가다가 고양이 밥도 줘야 된다고. 늦으면 고양이 굶어."
//지각대장 등장~ 이 아니고 진짜 미안 ㅠㅠㅠ 이것 저것 고민하다 보니 늦었어 그런데도 참 짧다... 혹시라도 아직 있다면 정말 미안하고 잘 부탁해ㅠㅠ! -
548 이름 없음 (6177543E+5) 2020. 7. 15. 오후 4:20:47>>547
"아! 알았어, 알았다고."
붉게 물든 이마를 문지르며 원망을 담아 너를 흘겨보았다. 아프잖아! 이런 폭력범 같으니. 하지만 뒤이은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다. 고양이가 밥을 굶는다는 건 우주의 종말이 와도 안 될 일이었다. 눌린 머리를 대충 손으로 빗으며 먼저 밖으로 나갔다.
그새 얼마나 지났다고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두어 번 점멸하다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미 노을이 완전히 진 후일 듯했다. 하교할 때쯤이면 해가 뜨려나. 일몰과 함께 등교해 일출을 보며 하교하다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아 참, 지금이 영화같은 상황이긴 하지. 사람들은 아직도 영화를 놓지 읺았지만, 더이상 재난영화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틀자 곧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다. 나와 네가 늘 고양이 밥을 주는 장소였다. 다들 어딜 갔나 기웃거리다 곧 예상치 못한 풍경을 보고 숨을 죽였다.
"야야, 빨리 이리 와 봐."
버려진 골판지 상자 안에 삼색 고양이가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꼬물거리는 새끼 고양이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어쩐지 요 근래 안 보인다 싶었더니, 새끼를 밴 거였구나. 아직 눈도 못 뜬 아기들이 못내 귀여웠다. 아침에 노을이 지고 곧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탄생한다.
"완전 귀엽다, 그치?"
어미 고양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네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이며 웃었다. 세상의 끝에서도 고양이가 귀여운 건 변치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함없겠지. -
549 이름 없음 (6177543E+5) 2020. 7. 15. 오후 4:21:35>>547 괜찮아 :)
-
550 이름 없음 (3389396E+6) 2020. 7. 15. 오후 4:51:09>>548
서둘러 머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는 네 모습에 입꼬리가 사선으로 올라갔다. 심성은 나쁘지 않은 친구니까, 그래서 좋아했던 거라 느끼면서. 거실에서는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다. 아침 뉴스는 아직도 기현상의 단서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등의 시답지 않은 뉴스만 내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란 것인지, 이래봬도 이쪽은 현실이었다. 그는 적당히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나와 빠르게 걸어나선 네 걸음을 따라 속도를 맞추었다. 이럴 때 만큼은 걸음이 빠르지.
지금 시간이 8시 쯤이었을까, 물론 저녁이 아니라 아침 말이지만 거꾸로 뒤바뀐 세상은 개의치 않겠다는 듯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비추며 어둠 속으로 빛을 삼키고 있었다. 겨울과 같은 추위에 어느덧 볼이 빨갛게 익는것이 느껴졌다. 그는 숨소리에 맞춰 피어나는 흰숨을 보면서 지치지도 않고 달려나가는 네 뒷모습을 쫓았다. 겨울의 날씨였지만 눈은 내리지 않은 덕분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덕분이었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틀자 너와 그가 마련해 둔 고양이 집이 보였다. 눈과 비에서 안전하라며 어설프게 만들어 둔 나무상자로 된 지붕 아래에서 고양이는 제 집인 줄 아는듯이 쉬어 가고는 했다. 네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더니 의외의 광경이 눈 앞에 놓였다. 익숙한 삼색 고양이와 함께 있는건 얼룩덜룩 무늬가 제각기 다른 새끼 고양이들이었다.
"안 보인다 싶었더니, 새끼를 밴 거였구나. 다행이다..."
젖을 찾아 안 보이는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새끼들이 사랑스럽게 꼬물거렸다. 그는 시린 손으로 가방 문을 열어 고양이 용 사료와 물을 꺼내놓았다. 미야옹, 고양이가 인사를 하듯이 울음을 빼었고 그는 통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많이 기다렸지, 하는 말을 꺼내며 빈 밥그릇에 사료와 물을 부었다. 네 옆에 쪼그려 움직이는 고양이들을 보고 있자니 네 작은 목소리가 살며시 들려왔다. 그는 간지러운 느낌에 잘 웃지 않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응, 다행이야. 아직 고양이가 남아 있어서."
세상이 끝나더라도 고양이가 남아 있다면, 세상의 끝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좋았다. 이 불안정한 하루에 너와의 일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그것만이 구원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태연하게 생각했다. 그때 시선 끝에 지저분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그는 네 어깨를 두드리며 그 고양이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어딘가 다친 것인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거무죽죽한 고양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
"저기 봐, 다친 고양이인가봐. 싸움에서 진 걸까?"
//고마워808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사랑해... -
551 이름 없음 (6177543E+5) 2020. 7. 15. 오후 7:07:11>>550
"어? 그러게."
절뚝이며 다가오는 고양이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남은 사료를 손바닥에 조금 붓고는 이리 와 봐, 옳지, 따위를 말하며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자칫하면 할퀴거나 물 수도 있었겠지만 여분의 그릇이 없었기에 맨바닥에다 쏟아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 고양이는 가까이 다가와 사료를 야금야금 집어먹었다. 행여 놀랄까 봐 함부로 쓰다듬거나 하지도 못한 채 눈으로 다친 다리를 훑었다. 다리뿐만이 아니더라도 몸 여기저기에 잔상처가 많았다. 최근에 영역 다툼이라도 있었던 걸까. 어쨌든 저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얘 병원에 데려가자. 어차피 교문지도도 없으니까 지각해도 상관없잖아."
동물병원은 아홉 시는 되어야 열었기 때문에 겨울 날씨 속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학교까지 지각하겠지만, 어차피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만약 네가 같이 가 준다면 혼자서 기다리게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뭐.
"하루쯤은 괜찮잖아. 아픈 애를 어떻게 그냥 둬."
설마 이 추운 날에 다친 고양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생각은 아니겠지. 그것도 고양이인데, 고양이인데! 간절한 눈빛으로 너를 올려다보았다. 부탁이야, 같이 가 줄 거지? -
552 이름 없음 (3389396E+6) 2020. 7. 15. 오후 7:32:50>>551
다정한 너는 어느새 사료를 손에 쏟아 고양이에게 건내주고 있었다. 고양이는 의외로 경계심이 없는지 느리게 다가와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추위로 귀가 먹먹한 와중에 까득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퍼졌다. 너는 붉어진 얼굴을 하고 추위 속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해댔기에 그는 조금 망설이듯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네가 돌아보는 순간 망설이는 기색이 드러났다. 어떻게 네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시간 쯤 늦어도 상관없겠지. 고양아, 이리와..."
얼룩덜룩한 고양이가 작게 울음을 내고 그에게 다가갔다. 사람 손이 익숙한 고양이다. 분명 누군가가 버린 녀석이다. 세상이 끝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비극은 손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고, 특히 힘 없는 동물에 한해 더욱 쉽게 일어난다. 그는 고양이를 안고 큰 길로 빠져나갔다. 버스정류장의 시간을 보자 8시 35분 이었다. 그는 불어오는 냉기에 고양이를 꼭 끌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고양이의 머리 끝에 이상한 돌기가 느껴졌다.
"음... 이 고양이 머리에 이상한 게 있는데..." -
553 이름 없음 (407538E+64) 2020. 7. 15. 오후 11:49:10날짜상으로 여름의 한 가운데, 계절답지 않게 공기가 유난히 선선한 날이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비 소식은 여기까지 닿지 않아서 내가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 평소처럼 반쪽짜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세 시. 의무적으로 배를 채우고 기계처럼 청소와 빨래를 한 뒤, 욕실에서 간단히 샤워까지 마치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야 먹먹했던 가슴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침대에 걸터앉은 채로 선풍기 바람에 머리를 말리며 작은 알약 하나를 삼켰다. 특별할 것 없는 신경 안정제.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나밖에 없는 공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뭇결무늬를 떠올렸다. 아지랑이와는 다른 그것을.
'딩-동-'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에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다. 택배는 시키지 않았는데. 별일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는 방문자에게 누구냐고 물을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니까.
'딩-동, 딩-동-'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침대에 몸을 묻은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나서였다.
// 불안증, 망상증이 있는 캐릭터를 간단하게 굴려봤어. 뜬금없는 상황도 괜찮으니 혹시 이어준다면 편하게 부탁할게 :) -
554 이름 없음 (3666877E+5) 2020. 7. 16. 오전 12:26:24>>546
얼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새 누군가의 눈에 띄고야 말았다.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제가 누워 있던 그 오두막의 주인이자, 쓰러진 자신을 옮겨서 치료한 장본인인 모양이다. 혹시 다른 이들을 불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으나 다행히 인기척은 한 명분의 것뿐이었다. 어찌 되었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임은 변하지 않지만. 그는 남몰래 인상을 찌푸렸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벌어진 상처로부터 퍼져나오는 통증에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성큼성큼 다가온 이에게 팔을 붙들리고야 말았다. 뿌리칠까 고민했으나 그랬다가는 되려 제가 나동그라질 모양새라, 그는 묵묵히 상대가 하는 대로 따랐다. 내딛는 발걸음이 힘겹기는 했으나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애초부터 멀리 나간 것도 아니었기에, 암자까지 돌아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아까까지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에 쓰러지듯 기대어 앉았다. 힘이 풀린 몸이 늘어지자 그제서야 잊고 있던 고통이 덮치듯 찾아온다. 이제는 습관처럼 아랫입술을 물고 몸을 둥글게 말았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품었고, 또 수도 없이 배신당한 것이었음에도.
#질문! 여기서 배경이 되는 전쟁은 혹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인가요 아니면 내전인가요 얘네 지금 의사소통은 되나 하는 걱정이 갑자기 들었다... -
555 이름 없음 (3010931E+5) 2020. 7. 16. 오전 12:48:01>>554
#으음..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일단 의사소통은 되는 걸로 하자XD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내일 이어줘도 괜찮을까...? -
556 이름 없음 (3666877E+5) 2020. 7. 16. 오전 12:53:54>>556
좋아 어떻게든 의사소통은 되는 걸로... 뭐 군인이면 외국어 좀 배웠을 수도 있지(막나감)
나도 슬슬 자러 갈 생각이었으니 괜찮다! 좋은 밤:D -
557 이름 없음 (6655876E+5) 2020. 7. 16. 오전 1:13:54>>553
세차게 울리던 차임벨 소리가 멈췄다. 시시껄렁한 벨튀나 하려는 동네 꼬마들의 장난질이 끝난 걸까? 당신의 염려와 다르게 현관문 여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게, 아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혼자 현관문 잠기는 소리가 나더니 집 안에서 툭툭하는 발걸음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거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주인님, 주인님. 왜 이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계세요."
분명 아까까진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전기 나간 라디오처럼 뚝 끊기더니 당신의 코 앞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 목소리다. 차분하면서도 침착하고, 또 차가운 목소리다.
"더위 먹으시면 어쩌시려고.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누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무단 가택 침입을 저지르며 자기를 주인님이라 부르는 상황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불 밖의 (아마도)여자는 그런 것 따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다. 여자의 손가락에 이불이 눌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대충 윤뜬금씨 짤방) -
558 이름 없음 (8656987E+5) 2020. 7. 16. 오전 8:19:22>>557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좁쌀만 한 벌레들이 통통 튀어 다니듯 불쾌한 촉감이 온몸에 선명하다. 허구이기 때문에 더 실재 같은 감각을 나는 이미 경험해 보아서 잘 알고 있다.
처음 망상을 겪었을 땐 내가 신병이라도 앓는 줄 알았지. 유령이 보이고 만져진다며 즐기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처음 그때의 묘한 설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어떤 여자가 벌건 대낮에 이런 짓을 하겠는가. 더구나 주인님이라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나니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눈 녹듯 풀어진다. 내심 반갑기까지 하다. 그녀는 진짜가 아닐 테니까.
"…괜찮아."
독한 약기운 탓에 목소리가 나른하게 깔렸다. 이불이 눌리는 것이 보이자, 부러 이불을 더욱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걷어내고 나면 달콤한 꿈은 곧 깨어질 테니까. 그 아픈 허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망상에 빠져드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외로웠어. 외로웠으니까. 몽롱한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메웠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애처롭고 위태로운 감각을. 나는 그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했다. 그 편이 망상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쉬웠으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그녀를 내 편, 내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망상이 등을 돌리면 분명 무서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 내가 망상을 미워하고 떠나려 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환청과 환촉으로 돌아올 테니.
이불이 눌린 곳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가락이 선명히 느껴져.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다가, 얇은 이불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오므렸다.
//세상에, 이걸 이어주다니... 천사 같은 참치야 ;^;
얘는 아직 망상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이불 밖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사람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무서울 것 같아...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이어줘! -
559 이름 없음 (6655876E+5) 2020. 7. 16. 오후 12:46:42"네, 반갑습니다. 주인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 쪽에서 가볍게 당황하는 기색이 전해져 온다. 이불 밖의 망상은 '주인님'을 처음 본다고 여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불 사이로 붙잡은 손에서는 은은한 냉기가 전해진다. 물 뿌린 쿨토시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망상은 손을 가만히 둘 뿐 같이 당신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확실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주인님, 혹시 추우십니까? 여름감기 걸리신 것 아니십니까?"
여름치곤 날씨가 선선하며 이불도 얇은 것이다. 하지만 망상은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듯 보인다. 혹시나 주인이 감기몸살에 오한을 앓고 있는 건가. 망상은 이불로 싸매고 옹송그린 주인에 대항하여 그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용을 쓴다.
"감기 걸리신 거면 쉬시면서 빨리 나으셔야 합니다 주인님.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한데."
"이불 걷으시고 잠시 저 좀 보시죠 주인님."
꼭 메이드나 시녀가 자기 주인을 챙기는 것 같았다. -
560 이름 없음 (6655876E+5) 2020. 7. 16. 오후 12:47:21>>559는 >>558에 잇는 글이야 깜빡했다...
-
561 이름 없음 (8656987E+5) 2020. 7. 16. 오후 4:07:26>>559
집안일로 며칠 밤을 새운 채 술에 잔뜩 취해있던 날이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가늘게 속삭이던 환청은 점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에 대고 손을 저으면 마치 물속을 헤집는 것처럼 그것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이질적인 두려움은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것과 소통을 계속하며 하잘것없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양 가증스러운 희열에 차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환상이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엔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당시의 내 상태는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각했지만 며칠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간단히 호전되었다. 간혹 그 생경한 느낌이 그리워 약을 끊어보기도, 더 먹어보기도 했지만 이미 병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 그것을 다시 겪는 일은 없었다. 힘들었던 때의 일이라고,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서야 그토록 바라고 찾아헤매던 환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기 아니야… 선풍기 바람이 차가워서 그래."
잡은 손에 온기는 없지만 너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져. 하지만 너를 바라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지금 눈을 뜨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곧바로 이 꿈에서 깨어버리고 말 거야. 마치 물에 빠진 솜사탕처럼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네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머리가 믿게 만들어야만 해. 그래서 애먼 선풍기 바람을 핑계로 이불을 더욱 그러쥐었어.
주인님이라는 호칭은 정말 낯간지럽네. 망상이 아무리 개인이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발현된다지만, 나 이런 취향은 아니었는걸. 미동도 않는 네 손을 잡고서 네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 그러는 동안 재차 이불을 걷으라는 네 요구에 못 이기는 척 눈을 감은 채 이불을 슬쩍 걷어내 보아.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네 목소리가 시작되는 허공을 가만히 더듬었어. 네가 정말 존재한다면 뺨을 쓰다듬는 듯한 모양새로 보였을까.
"…여기에 있어?" -
562 이름 없음 (3010931E+5) 2020. 7. 16. 오후 4:29:32>>552
"이상한 거? 어떤 건데?"
덜컥 겁이 났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종양 같은 거면 어떡하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이 바빠졌다. 만약 수의사 선생님이 오늘부터 병원 문을 닫는다고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종말이 다가와도 그렇지, 아픈 고양이를 버리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싶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8시 45분경이었다. 추위에 곱은 손을 불며 병원 앞에 쪼그려 앉았다. 병원 문의 'closed'라는 팻말이 9시가 되어도 그대로 있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불안하게 닫힌 문을 힐끔대다 내내 고양이를 안고 있던 네 맨손이 발갛게 물든 걸 발견했다.
"이 안에 넣어 놓자. 너 손 시렵잖아."
급한 대로 가방을 열고 네게 내밀었다. 어차피 안에는 필통밖에 없긴 했다. 이제 와서 교과서나 문제집을 챙길 필요성은 딱히 못 느낀 탓이었다. -
563 이름 없음 (3010931E+5) 2020. 7. 16. 오후 4:30:06>>554
"잠시 기다리고 계십시오. 일전처럼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경고의 말을 남긴 뒤 방을 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 오래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움직이려 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방을 오래 비우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 듯했다. 할 수 없이 제 몫의 식사는 포기하고 사내를 위해 미음을 쑤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식사를 거르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닌데 말이죠.
작은 반상 위에 미음과 수저를 올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든 것처럼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사내의 몸을 가볍게 흔들었다.
"입맛이 없으셔도 드셔야 합니다. 다 드시고 나면 붕대를 갈아 드리겠습니다."
사내의 손에 수저를 쥐어준 뒤 뒤로 물러나 바닥에 앉았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껏 쑤어온 미음을 남기는 일은 안 되었다. 애초에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이었지만. 여차할 때에는 직접 먹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사내가 식사를 시작하길 기다렸다. 한때 의원이었던 몸으로서, 병수발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
564 이름 없음 (6655876E+5) 2020. 7. 16. 오후 6:36:55>>561
"뒤에 있습니다. 주인님."
한숨 한 번과 함께 허공에서 목소리가 울린다. 당신이 이불 사이로 잡고 있던 손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목소리는 앞에서 들리는데 기척은 뒤에서 느껴진다.
하얀색이다. 피부도, 동그란 단발의 머리카락도 그 색이 만년설같다. 두 눈만이 시린 청색으로 형형히 빛난다. 하다못해 그 쪽은 하얗기라도 하지. 목 아래로는 피부에 색조차 없었다. 몸 안의 광택있는 남색 뼈가 비치고 그 뒤의 벽까지 환히 보인다.
신체의 곡선적 굴곡은 여자와 같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과는 멀리 동떨어진 외형 탓에 성적인 감정이 느껴질지는 모르겠다. 그것의 몸 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뼈 뿐이고 심장이나 허파, 창자 따위의 것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
기묘하면서도 몽환적인 모습이다. 판타지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현실의 존재가 아니다. 그럴 리 없었다.
"선풍기를 그냥 끄시면 될 걸, 왜 번거롭게 이불까지 뒤집어쓰셨습니까?"
찰칵. 선풍기 다이얼이 '정지' 쪽으로 돌아간다. 웅웅거리는 선풍기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은 적막해진다. 이따금씩 창 밖의 소리가 흘러들어온다. -
565 이름 없음 (6622261E+5) 2020. 7. 16. 오후 7:39:02>>562
"뭔가 뿔 같은게..."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심쩍은 태도였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뿔이었다. 손 끝에 머물던 날카로운 감촉에 눈썹을 찌푸리며 두 사람은 큰길을 지나 동물병원 앞 까지 도착했다.
걸어오는 동안 추위에 손이 붉어지고 그 사실을 네가 알아챘는지 가방을 내밀기에 그는 고양이를 네 가방 속에 넣는다. 역시 순한 고양이다. 이렇게 손을 탄 고양이가 어쩌다. 손을 만지며 병원 너머를 보고 있자니, 문을 열러 나온 원장님과 눈이 마주친다.
"어... 이른 시간부터 무슨 일이냐."
"고양이가 다쳐서요..."
병원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니 한기로 붉어진 뺨과 귓볼이 짜릿거렸다. 병원 안은 따뜻했기에 금새 긴장이 풀려 졸음이 쏟아졌다. 대기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다리에 붕대를 두른 채 밖으로 나온 고양이가 처음 만났을 때 처럼 울었다.
"다리를 다친 것 빼고는 별 이상이 없던데, 머리에 이상한 돌기가 하나 있더구나.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두상이 일반적인 고양이랑 다르던데... 아마 그렇게 생긴 고양이일지 모르겠다." -
566 이름 없음 (3666877E+5) 2020. 7. 16. 오후 10:16:52>>563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의 말은 대강 한 귀로 흘렸다. 어차피 지금은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었다. 눈까지 감은 채 고통을 삭이고 있자니 남자는 방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아까는 여길 벗어나는 데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는데, 이 방 외의 다른 공간이 있는 모양이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이자 찢어지는 고통이 꽂혀 와 겨우 속으로 비명을 삼켜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움직이기 어려울 듯 싶었다.
혼자 남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사라졌던 남자는 그릇이 얹힌 소반 하나를 가지고 들어온다. 귀찮음에 무시하려 부러 더 몸을 깊게 웅크렸더니 굳이 흔들어 깨우는 탓에 손에 숟가락까지 쥐고야 말았다. 그릇에는 끓인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미음이 담겨 있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환자 대접만큼은 제대로다. 괜히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미죽만 휘적거렸다.
"...여기가 어딥니까?"
한참을 멍하니 그릇만 바라보던 그는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되려 질문을 던졌다. 오래간 말을 하지 않은 탓에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진 채였다. -
567 이름 없음 (2781017E+6) 2020. 7. 17. 오전 3:50:28갑작스레 문을 열고 들이닥친, 갓 스물이 된 것 같은 군복을 입은 청년은 꽤나 심각한 몰골이었다. 파편이 스쳐지나가 벗겨진 살갗, 이마에 말라붙은 피와 거친 숨까지. 진흙이 잔뜩 묻은 소총을 든 채 내부를 슥 둘러보던 청년은 민간인으로 보이는 당신을 발견하고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다급히 총구를 겨누고, 숨을 고른 뒤 말을 내뱉는다.
“─? 아니면 우리말을 할 줄 아나? 알면 고갤 끄덕여.”
/ 국경지역 근처 시골마을! -
568 이름 없음 (3689557E+5) 2020. 7. 17. 오전 8:50:49>>567
늘 분쟁이 있는 국경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웃들도 떠난지 오래인 이곳에 여자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병들어 거동이 힘든 조부를 이 곳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총이 코앞에 들이닥치니 두려워 몸이 떨렸다. 여자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보였다. -
569 이름 없음 (5078938E+5) 2020. 7. 17. 오후 3:43:36>>565
돌기라면 아까 그 뿔을 말하는 걸까. 뿔이 달린 고양이라니, 금시초문이다. 하기사, 아침 아홉 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바깥을 보노라면 뭔들 불가능하겠냐마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머리에 뿔이 난 고양이 정도는 이상한 축에도 못 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혹시 모르니 하루 더 봐 주겠다는 원장님의 친절에 감사하며 지갑을 꺼내들었다. 원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됐다, 됐어. 뭐 큰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는 손님도 별로 없고, 이제 와서 돈을 모아 봤자 뭐 하겠니. 너희들 아직 학생이지? 그러지 말고 얼른 학교나 가라. 벌써 늦었다."
이런, 종말이 다가와 돈도 모으지 않겠다는 분이 학교에 가라고 말하다니. 어쨌든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하며 병원을 나섰다.
"다행이네."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플러를 꼭 여매며 말했다. 가로등이 켜진 거리에는 행인마저 얼마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못 해본 걸 하겠다며 버킷 리스트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우리처럼 일상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몇 없었다. Keep calm and carry on.
"우리도 빨리 가자. 춥다."
고양이가 치료받은 건 다행인 거지만, 동시에 날씨가 추운 것도 사실이었다. 빨리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네 팔을 잡아끌며 걸음을 바삐했다. -
570 이름 없음 (5078938E+5) 2020. 7. 17. 오후 3:44:11>>566
"이곳은 소담골이라는 곳입니다. 보아하니 타국에서 오신 듯한데, 어디 출신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한적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그저 소문에 불과했다. 단조로운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장사패가 물고 온 유희거리. 그는 그 풍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묵묵히 방관했다. 전쟁은 유흥 따위가 아닌 잔혹한 것이겠으나, 동시에 이들이 어떠한 악의를 지니고 그리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평생 마을을 벗어나본 적조차 없는 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다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배움이 길어서, 단순히 누군가와 누군가가 싸우고 있구나—이상의 것을 볼 수 있었다. 국경 인근에서 격돌 중인 이들 중에는, 이국의 군대도 다수 섞여 있는 듯했다. 듣기로는 그들의 무기는 이 나라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던데.
"드시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먹여드릴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비록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하나, 한때 의원이었던 몸의 도리로서 그에게는 저 미음 한 그릇을 환자에게 먹일 의무가 있었다. 전쟁이니, 국가 간의 이해관계니, 결국 전부 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부드럽지만 꺾기 힘든 결의를 담은 눈이 사내에게 향했다. -
571 이름 없음 (511951E+54) 2020. 7. 17. 오후 4:30:12>>569
원장님께 인사 드리고 병원을 나서자 주위는 한층 어두워져 있었다. 체감 시간으로 치면 밤 9시 정도였을까, 겨울의 서늘한 어둠이 하늘 아래를 감싸고 어두운 길 위를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밝히며 나아갔다. 그는 겨울이 만들어낸 네 숨의 흔적을 눈으로 좇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선생님이 걱정하실거야."
걸음마다 물보라처럼 숨의 흔적이 뒤따랐고 두 사람은 어둠을 헤엄쳐가는 물고기처럼 희미한 감각에 의지해 나아갔다. 학교라는 큰 건물을 전부 비추기에는 부족하다는 듯이 몇몇 교실에만 불이 켜진 채 빛나고 있었다. 자율등교를 실시한 영향도 있었다.
교실에 들어가자 보이는건 세 사람 정도의 학생과 멸망이 시작되고도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친히 등교해주신 교사 한 명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재앙이 시작되고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생활지식이었는데,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점이라던가 하는 개인이 원하는 수업을 아는대로 진행해 주고 계셨다.
"늦었네. 교탁에 있는 프린트물 들고 가라."
그는 너와 프린트물을 나눠 가지며 적당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곧 수업을 진행하는 목소리에 그는 수험이라도 치루듯이 열심히 필기하며 검은 눈을 빛냈다. 그때 복도에서 있을 리 없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녀 같은걸 출현시키고 싶은데 원치 않는다면 그냥 괴한으로 진행해줘. 그리고 길게 가도 될지, 아니면 곧 마무리 짓길 원하는지 궁금하다. -
572 이름 없음 (5078938E+5) 2020. 7. 17. 오후 9:03:49>>571 마녀.. 원치 않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생각 중인지 조금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난 길게 가는 것도, 짧게 마무리짓는 것도 좋아. 너참치 의견은 어때?
-
573 이름 없음 (69368E+55) 2020. 7. 17. 오후 10:34:02>>570
소담골이라. 혹여 대략적인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참전 직전 교육받은 이 나라의 지도를 떠올려 보았으나 짚이는 것은 없었다. 부상당한 몸으로 아주 멀리까지 오지는 못했을 테니, 짐작하건대 국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자그마한 시골 마을쯤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그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도회지라면 몰라도, 교허에서 외국인은 너무 눈에 띈다. 마을로 내려가기에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결국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야 말았다. 언제까지나 여기 눌러앉을 수는 없으니 탈출할 길을 찾아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말인가? 몸도 불편한 와중에 적국에서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대강 북쪽에서 왔다고 해 두지요."
잠시간의 고민이 끝나자 뒤늦은 대답이 돌아왔으나, 출신에 대한 대답은 얼버무려진 채였다. 굳이 지금 고국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괜히 입을 열었다가 민간인에게 정보가 새어나가면 좋을 게 없었으므로. 앞에 놓인 그릇을 빤히 내려다보던 그는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뻐근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팔을 움직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뒤늦게서야 거의 식은 미음을 입에 가져다 댔다. 입맛은 없었지만, 한참 비었던 배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은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
574 이름 없음 (511951E+54) 2020. 7. 17. 오후 11:22:35>>572 기현상이 기후적 현상이 아니라 판타지적 현상이라는 가정하에 교실에 마녀가 나타나 학생과 교사가 해를 입게되고 두 사람이 도망치거나 하는걸 생각해봤어. 만약 기후적 현상으로 두고 싶다면 아포칼립스 답게 괴한이 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
575 이름 없음 (3119968E+5) 2020. 7. 18. 오전 12:29:00>>564
잡았던 손의 공간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축 늘어진 이불의 무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아도 이전처럼 무언가 존재한다는 이질적인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 너라는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 후에 차분히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망상이 완전히 깨어지진 않은 듯싶었다. 무언가 실수라도 한 건지 그녀가 내쉬는 한숨이 묘하게 신경 쓰인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몸을 일으켜 바로 앉아 몸을 뒤로 돌렸다. 이러면 아마 그녀와 마주 보고 있게 되었을까. 잔뜩 긴장을 한 채로 누워있다 일어난 탓인지 약기운이 올라와 정신이 몽롱하고 몸에 기운이 없다.
순간, 선풍기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적막해진다. 반대로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아무리 망상이라 해도 실제로 가전기구 등을 직접 조작하는 일은 없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질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고 막. 꼭 감은 눈에 힘을 주고 아주 살짝 실눈을 떠서는 기척이 느껴지는 쪽을 바라보았다. 판타지에서나 나올 법 한 기묘한 형상의 존재가 눈앞에 '떠'있었다. 이거, 망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유령인가…? 따위의 생각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약기운 덕에 정신이 반쯤 나가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그 기이한 모습을 눈앞에 마주하고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하는 느낌이었다.
"너, 진짜야…?"
아직 반쯤 감은 눈으로 얼빠진 표정을 하고서 그렇게 물으며 그것의 얼굴 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여태 망상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이게 진짜라면 정말 유령이라는 이야기잖아. 이미 직접 선풍기를 끄기도 했고.
//많이 늦어서 미안해… 어제부터 좀 바빴어 ㅠㅠ
사실 샌즈부터 떠올랐지 뭐야 ㅎㅎ 얘는 정령이나 요정인 거야…? -
576 이름 없음 (3173479E+5) 2020. 7. 18. 오전 7:19:24>>575
"존재의 측면에서 물으시는 거라면... 네, 진짜입니다 주인님. 저는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당신과 망상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알 수 없는 물질로 이뤄진 만질 수 있는 것이든, 만질 수 있다 느끼는 것조차 환각인 그저 머릿속의 망상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당신이 그것의 얼굴로 손을 뻗으면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한쪽 눈을 반쯤 감으면서도 손길을 피하려는 기색은 없었다. 고개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찰랑거렸다.
"약기운 때문인지 지금 몸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저녁 때까지 누워서 눈 감고 계시죠 주인님."
그것은 당신이 먹는 신경안정제 통을 한 손으로 쥐어서 들어올렸다. 투명한 피부 안으로 손뼈 관절이 부드럽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꾸밈없이 보인다. 마치 그것의 성분표를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약통을 돌려가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이내 약통을 탁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놓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드는 기색은 아니었다.
"세 시간 후에 깨워드리겠습니다."
//와! 샌즈!
사실 정령같은 건 아니고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중이야. -
577 이름 없음 (7594744E+6) 2020. 7. 18. 오후 10:02:14>>576
마음속으로 오묘한 기대감을 품고서 잔잔한 물의 표면을 어루만지듯 그것의 얼굴을 좌에서 우로 훑었다. 보드라운 피부는 얌전한 연못에 잔물결이 이는 듯했고 기분 좋게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힘을 주면 바스라져 사라질까 조심스럽게 뺨을 타고 올라간 손가락은 그것의 머리카락을 한번 빗어내리고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대뜸 내민 손길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 사람 손을 탄 소동물처럼 귀엽게 보였다.
머릿속으로 망상을 관철시키는 것 따위의 의식적인 행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에 이젠 망상이든 환상이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넋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약통은 언제 집어 들었는지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마음이 뜨끔했지만 약의 성분표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아냐, 괜찮아."
그것이 재차 휴식을 권하기에 가볍게 눈꺼풀을 닫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내 정신을 혹사시켜서라도 이 망상에 계속 취해있고만 싶었다. 혹여나 정신이 맑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있지 않을까, 이 환상이.
너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허리를 감싸고 있는 구겨진 이불을 살짝 들어 보이곤 오른쪽 무릎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청아하게 빛나는 두 눈을 오래도록 소중히 여겼던 보물인 양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이리 온.'
주인님이라는 어색한 호칭 때문이었을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이질적이어서였을까. 너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반려이자 소유물로 느껴졌다. -
578 이름 없음 (8799298E+6) 2020. 7. 18. 오후 10:42:20" 야. 우리 어릴 때 했던 약속 기억나냐? "
아이스크림 막대를 잡고 있던 검지 위로 녹은 아이스크림이 툭 흘러내렸다. 새콤한 딸기향이 밤공기를 제치고 훅 끼쳐올랐다. 에이, 흘렸네. 여자 아이가 짜증 섞인 중얼임을 씹으며 툭, 모래를 찼다.
" 그거. 서로 20살 되기 전까지 애인 없으면 결혼하자고 한 거. "
모래를 찬 반동에 그네가 살그머니 밀렸다. 살며시 밀린 어깨 위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스치는 순간. 여자 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돌려 남자 아이를 바라보았다. 툭, 하고 아이스크림이 녹아 부스러진다.
" 야, 반 년도 안 남았다. 5개월 하고... 12일인가? "
그냥 그렇다고. 여자 아이가 다시 한 번 모래를 찼다. 작게 베어문 딸기 아이스크림에 이가 시큰였다.
#처음이라 짧게 썼어!
-
579 이름 없음 (8593538E+5) 2020. 7. 18. 오후 10:55:10>>571
자리에 앉아 지루한 눈으로 프린트를 훑어보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우리처럼 늦게 온 학생이 있나. 그렇게 납득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멈칫했다.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아니, 사람인가?—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검은 옷이라면 응당 먼지가 조금쯤은 붙어 있기 마련일 텐데,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한 옷자락이 묘하게 이질적이었다. 나이는 고사하고 성별조차 가늠이 가지 않는 외모. 십 대 여자아이라고 해도, 삼십 대 남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학생도, 교사도 아닌 사람이 어째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걸까.
"선생님, 밖에 누가 왔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에게 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향해 다가갔다.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물었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
580 이름 없음 (8593538E+5) 2020. 7. 18. 오후 11:01:16>>573
북쪽에서 왔다는, 두루뭉술한 설명에도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외모로 미루어 보아 북쪽에서 왔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사내의 외모는 언젠가 서책의 삽화에서 보았던, 또는 교역을 위해 온 이국 대사들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에. 상대가 대답하길 원치 않는다면 굳이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그리 생각하며 식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내심 잘 먹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릇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켠을 차지한 서랍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고 붕대와 약을 꺼낸 그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반상을 옆으로 치운 뒤 피가 배어나온 붕대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그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붕대를 갈아 드리겠습니다. 뒤로 도시지요." -
581 이름 없음 (3743459E+6) 2020. 7. 18. 오후 11:14:09>>578
여자아이의 말에 남자아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한쪽 눈썹을 올렸다. 발은 얌전히 모래 위에 올린 채로 이따금 조금씩만 앞뒤로 흔들던 남자아이는 튜브 아이스크림을 대충 물어삼키면서 무심한 얼굴을 유지했다.
" 뭐 그딴 걸 기억하고 있냐. "
헤아리듯이 살짝 시선을 치켜든다. 정확히 무슨 상황에서 그런 약속이 나왔더라. 몇 살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 난 기억도 안 난다. " 하고 반쯤 사실인 것을 그대로 툭 던졌다.
다시 튜브를 물자 아이스크림이 더 밑에 있었다. 밑바닥에 찬 얼음 덩어리를 양방향에서 손가락으로 짓누르다가, 뚜껑 가까운 자리를 잡고 이빨로 씹어 밀어올렸다.
" 5개월 12일 같은 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에 공식이나 하나 더 외워라.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는 알고 있냐? "
튜브 아이스크림으로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힐난했다. -
582 이름 없음 (8154219E+5) 2020. 7. 18. 오후 11:29:24>>580
이야기하길 꺼리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그 이후로 별다른 질문이 날아오지 않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채 숟가락을 든 손을 계속해서 움직였다. 미음이란 게 애당초 별 맛이란 게 있을 리 없었으므로, 이 움직임은 기껍다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적인 것에 가까웠다. 어쨌거나 그것은 느릿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졌고, 크지 않은 그릇은 곧 바닥을 보였다.
식사를 마치자 자신을 지켜보던 이는 붕대와 약을 챙겨 침대로 다가왔다. 그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뒤를 돌았다. 이전에 무리해서 움직인 것이 원흉이 되었는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끙 하는 신음성이 잇새로 튀어나왔다. 상처가 제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었다.
"...의원입니까?"
기존에 있던 붕대를 풀어내고 새로 붕대를 감는 손길을 가만 지켜보던 그는 문득 질문을 던졌다. 사실, 이 집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기는 했다. 이 정도로 세심하게 부상을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 -
583 이름 없음 (8799298E+6) 2020. 7. 18. 오후 11:36:21>>581
여자아이는 말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발을 찼다. 삐걱이는 쇳소리가 정적 대신 공기 속을 파고든다. 여덟 살 때였나. 오늘처럼 더운 여름에 손가락을 걸며 말한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아이가 다시 한 번 툭 모래를 찼다. 어릴 적의 기억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모래처럼 아득해진다.
" 왜, 재밌잖아. "
여자아이가 웃었다. 작게 키득대는 목소리였다.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물며 툭툭 손을 털어내던 여자아이가 별안간 싫어? 라며 뭉개진 발음으로 묻는다. 남자아이의 눈을 빤히 바라보던 시선이 슬그머니 손가락 끄트머리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부러 눈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시선이 완벽하게 마주하기 전, 눈길을 거둔 것, 그 뿐이었다. 여자아이가 끈적해진 손을 몇 차례나 문지르며 남자아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녹을 만큼 더운 정적이었다.
" 수학은 버린지 오래거든? 그리고 나 공부 잘 해. "
여자아이가 퉁명스레 받아쳤다. 원하는 대답이 아닌 모양이었다. 하여튼간.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약속을 걸던 여덟 살의 아이에겐 마법 소녀와 학교 앞 문방구, 달콤한 사탕 하나만이 삶의 전부였는데. 세상이 아이의 몸집에 비해 너무나도 거대해진 것만 같았다.
" 스무살 되면, 너나 나나 다른 곳으로 떠날텐데. "
뭐, 여기도 그렇게 촌구석은 아니지만... 여자아이가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다. 속으로 수 십번이나 예행 연습을 했건만, 아쉽다.' 그 한 마디는 그 끝내 입술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랜다. -
584 이름 없음 (8593538E+5) 2020. 7. 18. 오후 11:56:32>>582
"뭐, 그런 셈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더이상 추가적인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사내가 그러했듯이, 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는 있었다. 입을 다문 채 온전히 붕대를 갈고 상처에 약을 바르는 일에 집중했다. 어렵지 않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은 머릿속의 잡념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다.
"다 되었습니다."
피 묻은 붕대를 버리고 남은 붕대와 약초는 다시 장에 넣어놓은 뒤 사내를 부축해 자리에 눕혔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에 유난히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주무시지요."
아직 삼경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사내의 부상을 생각하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터였다. 호롱불을 불어 끈 뒤 방문을 열었다. 하나뿐인 침상은 환자에게 내어 주었고, 혼자 사는 데다가 손이 찾아올 일도 없는 집에 여벌 이부자리가 있을 리는 만무했으므로 오늘 밤은 꼼짝없이 부엌 신세일 듯했다. 나도 참 무르군. 웃음이 나왔다. -
585 이름 없음 (9847248E+5) 2020. 7. 19. 오전 12:14:26간단한 대답을 끝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체를 캐물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으나, 그만두기로 하였다. 알아 봤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어 있겠는가. 그는 붕대를 가는 동안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 보는 평안함이 낯설었다.
치료가 끝났는지 남은 붕대와 약재를 도로 서랍에 집어넣은 남자는 저를 부축하더니 침대에 눕혔다. 사소한 움직임에도 온몸 곳곳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지기야 했지만 이제 자정이나 되었을까. 전쟁통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던 그가 수면을 취하기에는 한참 이른 시각이었으나, 오늘 유난히도 긴 하루를 보낸 탓인지 자리에 눕고 호롱불마저 꺼지자 급격히 고단함이 밀려왔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 다른 방이 있던가. 가물해지는 의식 사이로 걱정 비슷한 것이 끼어들었다.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오두막 내부를 상세히 둘러본 적이 없으니 무언가 떠오를 리 만무했다. 하기야, 그가 지금 누군가를 걱정할 신세가 되던가. 헛웃음을 지은 그는 잠시간 허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꿈을 꾸지는 않았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
586 이름 없음 (9847248E+5) 2020. 7. 19. 오전 12:15:00>>585 >>584입니다... 앵커 까먹었다.......
-
587 이름 없음 (4709763E+4) 2020. 7. 19. 오전 12:16:26>>585 음.. 여기서 마무리지을까 아니면 좀 더 잇는 걸로 할까?
-
588 이름 없음 (9847248E+5) 2020. 7. 19. 오전 12:28:04>>587 어느 쪽이든 좋아. 깔끔하게 마무리지어도 좋고,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도 좋고... 참치가 편한 대로 해 주면 될 것 같다!
-
589 이름 없음 (4709763E+4) 2020. 7. 19. 오전 12:31:28>>588 그럼 여기서 마무리짓는 걸로 하자. 텀도 길고 퀄도 안 좋은데 끝까지 돌려 줘서 고마워 너참치야 :)
-
590 이름 없음 (9847248E+5) 2020. 7. 19. 오전 12:33:08>>589 나야말로 고마워.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 너참치:D
-
591 이름 없음 (1201554E+5) 2020. 7. 19. 오전 12:42:06>>583
남자아이는 다시 튜브를 입에 가져가며 여자아이가 계속 모래를 차는 소리를 들었다. 왜, 재밌잖아. 하는 말을 적당히 넘기며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었지만 이어지는 물음에는 다소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했다. 여자아이가 눈을 피해 찰나동안이었지만. 끈적해진 손을 문지르는 여자아이는 마치 남자아이의 답을 기다리는 듯해 보였다. 남자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양 비스듬히 고개를 까닥였다. 싫고 말고 할 게 있어? 명랑한 어조로 답변하면서.
" 어련히 그러시겠어요. "
그래서 6평은 잘 보셨는지 몰라, 그런 말을 이으려고 장난기 담긴 얼굴을 그쪽으로 돌렸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여자아이를 보더니 입을 천천히 다물었다. 어쩐지 지금이 그런 시시한 농담이나 던질 적절한 기회는 아닌 듯해서. 밤하늘 가운데 얼마 없는 별을 살살 찾아내 끄집어내려는 양 세심한 눈빛. 여자아이는 추억을 거론하고 나서 갑자기 저 모양이었다. 적어도 남자아이의 시선과 생각으로는. 그리고 곧이어 그녀가 꺼낸 말도 매한가지로 묘하기 그지없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의도가 궁금했다.
" 갑자기 왜 그래. "
안타깝게도, 남자아이는 애틋한 분위기에 녹아드는 방법을 몰랐고, 같은 의미에서 말을 돌려말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말을 내뱉은 직후에 미간을 좁히다가, 아이스크림 튜브 포면에 녹아내리는 얼음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다음에 할 말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냐? 심사숙고하여 드문드문 건넨 이 말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다. 결국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물어 삼키면서 스스로 입을 다물렸고, 얌전히 기다리기로 했다. 평소에는 막말을 주고받으며 장난스러웠던 사이인데 갑작스럽게 여자아이를 이렇게나 배려하려 드는 이유는 그도 찾지 못했다. 어쩌면 여자아이가 밤공기에 그대로 부서져내릴 듯한 모습이어서일지도 몰랐다. 눈빛이 그랬고,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남자아이는 확신에 차지 않은 생각을 흘려보내며 튜브 끝을 가볍게 물었다.
#남자아이 성격을 조금 답답하게 잡았는지도 모른단 생각이 지금 드네. 잇기 힘들거나 하면 말해줘. :) -
592 이름 없음 (6191362E+5) 2020. 7. 20. 오후 5:00:57손이 내쳐진 게 가장 처음이었고, 혀끝으로 볼을 누른 게 다음, 머리카락을 쓸며 헛웃음을 뱉은 건 거의 동시였다.
"...이래서 내가 애새끼들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거의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손이 꽤 매운지 제 손 위로 빨간 자국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구석에 웅크린 인영을 바라보다 삐딱하게 물었다.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한데다 방금 일까지 겹쳤으니 말이 곱게 나갈 리 없었다.
"제 발로 기어들어와놓고 왜 피해자인 척이야?"
시간이 없다고. 애나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어. 운 나쁘면 내일, 아니 당장 1분 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에. 그리고 저 정도 컸으면 아무리 애라도 제 앞가림은 할 줄 알아야지. 현장 한 번 뛰었다고 저럴 일이야?
"아님 뭐 기대한 게 안 이루어져서 시위하는 거야? 가족 같은 따뜻함, 다정함 그런 거? 너 고아라며. 처음부터 없던 게 이제와서 생길 거라 생각해?"
귀찮아 죽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있던 데로 가라고 하고 싶었다. 아님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라도. 하지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기엔 양심에 찔렸고, 괜히 제 말에 자극받아 진짜 나가기라도 했다가는 분명히 시안이 다시 찾아오라고 할 게 뻔했다. 지금 하는 보모 노릇도 충분히 끔찍하다. 더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뭐가 됐든 가이딩은 받아. 네 폭주에 말려 사이좋게 뒤지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정확히 입술만 끌어올려 웃으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도 내치면 정말 기절이라도 시켜서 가이딩을 받게 하든가 해야지.
// 센티넬버스에 정부군vs안정부군 배경이고 내 캐릭터는 안정부군 가이드야! -
593 이름 없음 (6156469E+5) 2020. 7. 21. 오전 12:21:58>>592
전투 후에는 늘 그랬지만, 온 몸이 지끈지끈하다. 좀 가만히 쉬면 나을 것 같은데, 옆에 와서 멋대로 내 몸에 손 대려다가 얻어맞고도 안 가고 왱알거리고 있는 놈 때문에 머리까지 지끈지끈하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반정부군에라도 들어와봤는데, 큰 실수였던 모양이다. 순 미친 인간 집단이잖아. 아니 모두가 미친 건 아니겠지만 저 인간 모기는 확실히 미쳐보인다. 가만 내버려 두라고 했으면 좀 꺼질 것이지 왜 옆에 와서 왱왱거리는 거야,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나. 겉보기에 어려보인다고 어린애로 단정짓질 않나, 좀 쉬겠다는데 귀찮게 굴고 손 대려고 한 건 지면서 안 받아줬다고 무슨 가족같은 따듯함이네 다정함이네 말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를 않나. 가입조건이 센티넬이나 가이드면 된다더니 진짜 센티넬이나 가이드기만 하면 아무나 받나보네.
돈이고 뭐고 좀 더 나은 집단을 찾아야겠다. 여기는 확실히 오합지졸 무리니까 더 제대로 된 곳이 있겠지.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평소보다 능력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낯선 인간이 내 몸에 손대는 건 싫어서 살살 해둔 결과, 적어도 이 자나 여기놈들을 따돌릴 정도는 남겨놨다. 저 헛소리 더 들어주는 게 능력 쓰는 것 보다도 더 지치니까 더 꾸물대지 말아야지. 정신을 집중하고 아지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순간이동했다. 조금 어지러워도 견딜만 했고 바깥 공기가 반가웠다. 그대로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안녕이다, 헛소리꾼 있는 오합지졸 반정부군 집단. -
594 이름 없음 (0287692E+5) 2020. 7. 22. 오후 11:38:51장원의 딸, 이라고 불리우는 한 소녀가 있었다. 물론 영주의 딸이라는 점에서 그녀를 장원의 딸이라 부르는 것은 무리가 없을 지도 몰랐다. 특이한 점은 다른 영주의 딸들은 모두 영주의 따님과 같은 딱딱하고 동떨어진 호칭으로 불리는데, 그녀는 장원 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원의 딸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벨라, 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구불거리는 적갈색 머리를 풀고는 코르셋이나 하이힐은 던진 채 편안한 차림으로 망토 하나만 걸치고 장원 이곳 저곳을 누비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눈부신 미소와 밝은 초록 눈으로 여기저기 사랑스러움을 뿌려대는 그녀를 백작 내외는 점차 포기한 듯 그녀와 농민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못본채 해 주었다. 그것은 장원 내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그녀의 환한 얼굴을 농민들은 언제나 동경하며 또 햇빛처럼 감사해하였고, 그녀로 인해 농민과 영주의 사이는 돈독해져 갔으며, 실제로 그녀가 베푼 많은 호의로 쌓아 올려진 신뢰를 백작도 오랜 기간 느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자정에 가까운 시각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림으로써, 모든 신뢰는 무너지고 장원은 불바다라도 된 것마냥 타올랐다. 자발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횃불을 들고 영주 직영지는 물론이거니와 공유지, 주변 산까지 벌겋게 타올라도 끝내 아무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산에서 발견된 그녀의 백마 시체를 제외하고는.
-
" ...도망가지 않을 테니 안대만이라도 풀어줘요."
알고는 있었다. 내가 꽤 특별하게 타고났다는 것 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느낀 적이 없었고, 인생은 따스하고 쉬웠으며, 나는 아름다웠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쩌면.. 나도 마력을 타고났다는 저 먼 나라. 비밀스러운 저 페렌필 섬 나라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처음 만난 낯선 이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이 악의가 눈물날만큼 반가웠다.
// 뭔가 판타지! 신비! 뽀짝(?) 중세! 이런 느낌이야. 스토리를 딱히 정한 건 아니니 상상을 더해서 즐겁게 이어줘! -
595 이름 없음 (8549837E+6) 2020. 7. 23. 오전 12:38:02>>549
―
2020년 7월 23일 목 오전 12:36
" 오, 가엾은 아이. "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한겨울 잿빛 눈송이를 잔뜩 삼킨듯 서늘했다. 별안간, 장원의 딸을 바라보던 여자의 푸른 눈이 싸늘한 안광을 내뿜듯 반짝였다. 두터운 벽이 높게 쌓인 탑의 자그마한 창틀 사이로, 한줄기 햇볕이 힘겹게 스며들어 그 이름도 영예로운 장원의 딸을 비추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은 탓이었다. 여자가 한 발짝, 장원의 딸을 향해 걸었다. 딱딱하고 한기 서린 돌바닥과 높은 구두굽이 맞부딪히며 그 소름 끼치는 발자취를 소리내어 울부짖는다. 눅눅한 공기와 비 내리는 아침의 습한 냄새. 그럼에도 물기 없이 건조한 돌바닥은 묵묵히 여자의 구둣발을 받아냈다.
핏기 가신 손가락이 장원의 딸의 적갈색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선혈을 상기시키는, 생명력이 가득 차보이는 적갈색 머리칼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걸려들며 부드럽게 여자의 핏기 가신 손등을 타고 흘렀다. 여자의 핏기 가신 손은, 과거 아름답게 흘러넘치던 생명력을 모조리 빼앗긴 채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파처럼, 그 붉은 머리칼에 비하여 남루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패자를 내려다보듯 오만한 눈으로 장원의 딸을 훑던 여자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대로 여자는, 따스한 왼 뺨을 냉기 어린 손길로 감싸쥔 채, 작은 웃음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 이름이 무엇이니, 아가. "
단연코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의 형태는 아니었다. 마치 답을 훤히 알면서도, 부러 궂은 질문을 던지는 어린 아이의 얄팍한 얄미움과 같았다. 여자의 목소리가 탑 안을 감싸돌았다. 마치 겨울 같은 그 목소리는, 그 존재 만으로도 한기를 몰고오듯 섬뜩했다.
" 내 이름은 무엇일까, 아가. "
어서. 여자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을 재촉했다.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즐거운 듯 웃음을 삼키지 못하고 킥킥대는 소리를 흘리며.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름의 자리를 대신해 사람들의 입방아를 오르내리며 공포를 흩뿌리는 근사한 별명이 있었으니, 그리 불행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여자는 내심 장원의 딸이 자신의 이름을 내뱉기보다는 그 가슴 벅차고 황홀한 별명을 입에 올리길 바란 것이다. 어서, 나를 마녀라 불러다오. 여자가 아랫입술을 잘근이며 웃었다. 장원의 딸이 저를 무어라 부를지 궁금해 미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일단 내가 막 떠오른대로 이어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ㅠㅠ 혹시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말해줘...! -
596 이름 없음 (8549837E+6) 2020. 7. 23. 오전 12:38:50>>595 앗 메모장 어플을 그대로 복붙했더니... 위에 날짜랑 요런 것들은 무시해줘ㅠㅠ
-
597 이름 없음 (3806683E+5) 2020. 7. 23. 오전 1:06:26>>595
싱그럽던 두 눈은 안대 속에 갖혀 버렸다.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따듯한 빛과 같은 장원의 딸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이 내겐 생기였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라곤 없었는데, 그 따듯하던 보금자리가 이제는 백 년 전에 꿨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확실한 것은, 내게 와 닿는 이 한기가 내 현실이라는 것. 안대 때문에 분간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밤은 지나가고 새벽, 혹은 아침일까. 나를 애타게 찾을 '그 백작 성'의 사람들 보다도 푹신하면서 썩은 풀 냄새가 강하던 볏짚이 더 그리워 눈물이 흘렀다. 언제나 벗어나고 싶던 영주의 성과 따듯했던 농민들의 손길 두 가지가 존재하던 예전의 장원이 그리운 만큼 역겨워 나는 헛구역질을 연거푸 했다.
가엾다라. 아냐. 난 그곳에서 빛날 수 있었어.
차가운 손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자 그 한올, 한올. 머리 끝에서, 내 두피까지 서늘하게 소름이 돋아났다.
" ...절 정말 몰라서 물으시나요?"
볼에 닿은 손에 그대로 내 떨림이 전해질 것을 알기에 수치스러웠다.
" 안대를.. 풀어준다면 맞춰보지요."
힘이 풀려 주저 앉아 있는 다리에 힘을 주며 나는 그렇게 그녀를 도발했다. 내 눈을 본 사람들은 어김없이 나에게 호의를 품었기에, 그것을 아는 나는 언제나 눈에 집착했다. 너도, 내 눈을 봐야해.
//아냐! 이어준 것만으로 고마운걸!
-
598 이름 없음 (8549837E+6) 2020. 7. 23. 오전 2:05:00>>597
" 장원의 딸을 어찌 모를 수 있을까! "
오, 이런. 여자가 과장된 어투로 외쳤다. 숨을 죽이지 못한 잔웃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퍼진다. 마치 희곡을 연기하듯, 혹은 콧노래를 흥얼이듯. 그렇게 짤막한 대답을 내뱉는 여자가 다시 한 번 장원의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작은 떨림이 손길을 타고 흘러온다. 여자는 장원의 딸의 떨림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 잔 꾀가 많구나, 아가. "
앙큼하게도. 여자가 뺨을 쓸어내리던 손을 거두었다. 손길 끝에 남은 살결의 떨림이 아쉽게 느껴졌다. 여자가 손끝을 문지르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장원의 딸의 머리칼에서, 안대에서, 주저 앉은 다리에서, 다시 탑의 꼭대기에 달린 자그마한 창틀로.
" 페렌필…, 아름다운 나의 고향. "
여자가 입을 열었다. 입꼬리에 오묘한 미소를 내걸은 채로. 여자는 굽혔던 허리를 다시 꼿꼿이 펴내고, 이번에는 무릎을 굽혀 앉아 장원의 딸과 시선을 마주했다. 정확히는, 안대에 가려진 시선과.
" 너는 네 스스로를 페렌필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 하더구나. "
여자가 살그머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차가운 손길은 장원의 딸의 이마로 향한다. 그녀의 이마 한 켠을 한 번 쓰다듬고, 그대로 손길을 흘려 뺨을 쓰다듬고. 입술까지 내려온 손길을 다시 거슬러 올린 여자가 안대의 끄트머리를 가볍게 쥐었다. 그렇게 안대를 풀길 원한다면야. 여자가 느릿히 콧노래를 흥얼였다. 가닥가닥의 불완전한 음정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콧노래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풍겼다.
" 어떠니, 아가. 내가 너를 왜 여기에 데려왔을 것 같니? "
여자가 천천히, 안대를 끌어내렸다. 장원의 딸의 아름다운 눈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반쯤 드러난 순간, 여자는 안대에서 손을 떼어낸 채 다시 한 번 미소를 머금었다. 반쯤 보이는 그 눈동자를 똑똑히 응시하며. 입꼬리를 잔뜩 휘어낸 채로 푸른 눈을 반짝이는 것이다.
" 사람들은 나를… "
느릿히 단어들을 나열하던 여자가 별안간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를 곰곰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내지는 누군가의 반응을 골똘히 살피는 것 같기도 했다.
" 마녀라 불렀지. 내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는데 말야. "
뒤이어진 말소리는, 차갑게 얼어붙다 못해 제 한기를 못이겨 쩍 금이 간 듯 싸늘했다. 한겨울을 잔뜩 녹여낸 여자의 목소리가 그 끝을 흐리며 사그라든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여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여전히 장원의 딸의 눈을 꼿꼿이 응시한 채였다.
# 갑자기 눈의 여왕이 생각나는 바람에....!! -
599 이름 없음 (0759247E+5) 2020. 7. 24. 오후 11:26:21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아니, 하늘에 정말 구멍이 뚫렸다면 그곳은 분명 맑았겠지. 쉴 틈 없이 억세게 쏟아져 내리는 장맛비에 모두가 젖어, 전부가 시들고 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고 있어. 이제 나와 같네.
아니ㅡ,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도 안 되지. 절대 몰라.
금빛 소녀의 머리칼은 잿빛에 물들어 탁한 빛을 토해내지만 분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카만 먹구름이 하늘을 빈틈없이 메우고 빛 하나 들지 않았으니 소녀가 빛나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잔뜩 얽히고설켜 부스스한 머리칼을 가진 금빛 소녀는 우울의 냄새가 그득한 그곳에 존재했다. 임대가 오래전부터 크게 쓰여있는 한참 낡은 건물. 입구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하늘을 피할 곳 따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소녀는 죽은 듯이 그 자리에 쪼그려.
온기는 이미 깊은 저 지하 바닥에 쳐박혀 붉은 적혈구가 투명하게 비치던 입술의 빛은 새파란 멍처럼 아래로 아래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나쁘지 않은데. 갈라진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리던 소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점퍼 주머니를 뒤적여 너덜너덜한 담뱃갑을 꺼냈다. 그러면서도 결코 젖지 않게 그 작은 손으로 빗물을 막아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그녀의 곁엔 이미 부서진 우산, 혹은 쓰레기만 나뒹굴 뿐이었다.
혀를 차는 소리는 빗소리에 파묻히고, 소녀는 그 네모난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인간이 그리 많이 지나다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빗물에 잠겨 허덕이는 생쥐 따위 담을 여유 따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녀는 작게 좆같네 라던가, 시발 따위의 비속어를 지껄이다 처진 눈썹으로 잠깐 울상을 지었을까. 무릎 위 두 팔에 얼굴을 묻은 소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듯했다. 죽지 않을게 당연하니까.
따스한 볕이 보고 싶었다. 몇 주간 사정없이 계속되는 우울에 빛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었나 희미해져 간다. 씨발 신이란 게 있으면 이러지는 말았어야지. 비좁은 옷의 틈새 사이사이로 얼룩덜룩한 멍 자국들이, 얼굴의 얇은 피부에 터져있는 혈관이 소녀의 과거를 고스란히 훑어낸다. 빛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면 꼭 한번 쥐어보고 싶다고. 나의 깊이 파고들어 녹여줄 무언가.
쉬지도 않고 쏟아져 내리는 빗물이 이젠 고통으로 느껴질 때 즈음, 흐리멍덩한 의식이 졸리다고 생각했기에 감은 눈을 평생 뜨지 않기로 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의 끈이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고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이 느낌을 이미 알고 있어. 목 주위 흉터가 아리다. 기껏해야 쓰러지는 게 다겠지만, 운이 좋으면 검은 네 개의 바퀴가 밟고 갈 수도 있잖아. ... .....
그 순간 찰나의 햇살이 관통했다.
매우 작아 흘려 버릴 수 있었음에도 그 잔물결이 사뿐히 내려앉아 겨우 붙잡혀 버렸다. 후두둑 떨어져 내리던 통증도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다. 금빛의 소녀는 한 움큼의 다크서클과 창백하고도 서린 얼굴을 조금 들어 조금도 뜨지 못하는 눈으로 겨우 아른거리는 흰 빛을 앙상한 팔로 힘겹게 붙잡았다. 그것은 정말, 정말로 따스해서. 저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버리고 그 부드러운 빛을 잡아냈으니 이곳은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리고 이곳이 여전히 빌어먹을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정신이 정말 아득하긴 했었던지. 당신의 온기가 담긴 목소리가 겨우 소녀를 그 캄캄한 먹물 속에서 끄집었다. 소녀는 파르르 떨리는 눈가로 당신을 힘겹게 올려다보며 반도 뜨지 못한 눈꺼풀을 느릿히 꿈벅였다. 여전히 잡은 손에 힘을 놓지 않은 채로. 상황을 알아차린 소녀의 표정은 얼마 가지 않아 잔뜩 찌그러져 당신을 아주 깊이 증오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멋대로 뻗었던 손을 멋대로 잡았던 소녀의 손끝에 한 맺힌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길지 않은 그 손톱이 당신을 탓하듯 깊게. 깊게. 파고들어 붉은 곡선을 만들 것만 같이. 소녀는 절실했다.
"네가 뭔데."
씨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잠긴 목소리가, 아니 발치에 나뒹굴며 부서져 날카롭게 이를 빛내는 우산대로 당신을 금방이라도 찔러버릴 듯한 날이 선 목소리가, 당신을 찌르고, 찌르고, 찔러.
단지 우산을 씌워준 인물에게 다짜고짜 거친 욕설이나 내뱉는 미친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미친 금빛 소녀는 어쩐지 당신의 손은 놓지 않은 채 점퍼 주머니 속 검은 담뱃갑을 꺼내 들었다.
"우산만 주고 꺼져."
앳된 얼굴이 당신을 관통한다. -
600 이름 없음 (0606823E+5) 2020. 7. 25. 오전 12:42:10>>599
"그건 안돼."
그러나 그 차분하고 온화한 어조는 그만큼이나 단호했다. 소녀에게 처음으로 건네어졌던 괜찮아? 하는 첫 마디만큼이나 그 말은 나직하고 조용했음에도, 그것은 무색의 빗소리 사이를 힘있게 뚫고 소녀에게 닿았다.
"하나밖에 없는 우산이니까."
어찌 보면 얄팍한 동정심의 한계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동정을 베풀며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고급스러운 사고활동 나부랭이를 할 만큼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소녀는 빗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람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한 것뿐이다. 그 나직한 목소리에는 뻐기거나 업신여기는 기색이라곤 없었다. 그것은 그저 평이하고 차분할 뿐이다. 어떤 부류의 인간은 오히려 그것에 더욱 신경이 거슬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어찌되었건 그렇게 말했다.
"대신, 네가 가는 곳까지 씌워줄게."
그건 어쩌면 소녀에게는 참 무심하게 잔인한 말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
왜인지 흐리멍덩하고 탁한 날씨 속에 흐리멍덩하게 보여 소녀보다 키가 얼마나 큰지, 소녀의 얼굴이 비치는 눈동자가 어떤 색인지도 모를-회색인가?- 그 작자는, 그러나 그 큼직한 손만은 퍽 따뜻했다.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증오가 손등에 조그만 초생달 너댓 개를 그리고 있어도 그 작자는 표정 한 치 흔들리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움찔대지 않는다. 하얗게 파인 손톱자국은, 과즉 진하게 물든다.
네가 뭔데, 라는 소녀의 앙칼진 분노를 그 작자는 묵살해버리기로 한 듯하다. 어떤 대답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이라고 할까, 그 자의 우산대는 소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녀에게 건네어지지도 않는다. 제멋대로이면서 단호한 호의다. 얄팍한 동정심? 돼먹잖은 흑심? 그 호의는 정말이지 어떤 색깔도 없었기에, 소녀가 가장 화풀이하기 좋은 색깔을 골라다가 칠해놓고 어느 욕설이건 골라서 마음껏 퍼부어도 괜찮을 성싶다. 날카로운 말로 몇 번이고 퍽퍽 찔러대도 이 색깔 없는 호의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걸로 붙여."
어쨌건 이 사람도 퍽이나 글러먹은 인간인 것 같다. 소녀가 정말로 법이 정한 성년의 나이에 아직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성년인지 알 길이 없다지만, 어찌되었건 소녀는 담배나 술 등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라고 생각될 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래서 소녀를 미성년자로 간주해도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자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소녀에게로 내밀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우산 손잡이는 겨드랑이에 끼워놓은 채로. 그 손끝에 타오르고 있는 쥐똥만한 조그마한 빨간 잉걸불에서는 소녀가 아주 잘 아는 냄새가 났다. 그 타오르고 있는 꽁초는 까만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것들과 똑같은 것이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의 외투 안주머니에도 까만 담뱃갑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사람의 팔에 꿰어져 있는, 종이봉지가 담긴 큼직한 쇼핑백 안에도 새로 산 까만 담배갑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
601 이름 없음 (3118535E+5) 2020. 7. 25. 오후 12:26:02>>600
소녀는 피곤해 보였다. 뜬 건지 만 건지 모를 아래의 눈꺼풀로 능숙한 한 손의 스냅은 소녀의 희멀건 입술에 검은 막대를 물린다. 지쳤다, 지쳤다라.
찰나가 반복해서 스치고 순간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 차가운 빗소리가 귀를 가득해서 메우다 못해 넘쳐흐르고 있었으니 물속에 잠긴 먹먹함에 그 누가 발버둥 치든 보글보글 고요한 거품만 방울 거릴 뿐 아무것도 방해해선 안 되는 거였다. 그 속을 깊이 헤엄쳐 제게 닿아 오는 일이라곤 이승에게 작별을 고하는 종소리가 전부였어야만 했다. 거세게 바닥에 튕겨 빗발치는 빗소리는 소음을 내었고 당신의 고요한 목소리는 소녀에게 진정으로 흐르고 있었으니. 부디 살결로 느껴지는 존재에 소녀는 건조한 단어를 토해내듯 뱉어내었다.
"같잖아."
굳어 있던 눈가가 실룩였다. 그래, 눈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꿰뚫을 것 같다거나, 녹을 것만 같다거나, 혹은 태풍의 한 가운데. 어느 쪽이든 어색하지 않은 당신을 상반되는 따스한 햇볕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은 심히 이질적이다. 실은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게 분명한 거지. 빌어먹을 정도로 맑은 이 속에 금빛 불순물이 담겨선 내리쬐는 모든 것을 반사 시키고. 쪼개진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게 희망이나 기적을 바라는 건 얼간이나 하는 짓이다.
어쩌면 빛을 바라는 소녀가 단지 미쳐서는 꿈을 꾸는지도.
인간의 모든 호의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그게 불순하든 아니든.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썩 평이했으므로 그 의도가 불투명했으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당신이라는 작자의 얼굴을 응시하려 애썼다. 무겁게 무겁게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과 컴컴한 공간 속에 당신은 그저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꼭 구름 속에 가려진 사람처럼 굴고. 소녀는 포기가 빨랐다.
"그럼 평생 여기 있던가."
퍽 퉁명스러운 소녀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결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고 그 소리마저 거센 빗줄기에 금방 흩어져 버렸다. 인간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악취미라도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정말 소녀의 말대로 꺼져주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갈 곳 없는 짐승에게 아량 넓은 오지랖의 따스한 손길 또한 치명적인 독인 게 뻔하니. 때문에 소녀는 먼저 놓지 못한다. 손끝에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는 제 것 아닌 붉은 날것은 잿빛 속에 유일하게 선명했다. 정 거슬리게 군다면 트럭에 치이기 전까지 에스코트를 부탁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꼭 저승사자라도 되는 것만 같으니 구세주라고 불러 드려야 하나. 하 내뱉어지는 웃음도 한숨도 아닌 실없는 숨소리에 날 서 있던 손끝의 힘이 풀렸다. 결국 당신도 지쳐 바스라지기 마련이다.
"머저리."
하하. 소리 없는 웃음과 휘어지지 않는 눈꼬리와 입술이었지만 소녀는 분명히 그렇게 웃었던 것 같다. 여전히 당신의 느른 손 위엔 가느다란 소녀의 손끝이 느슨히 걸쳐 있었고 당신이 건넨 것과 같은 검은 선이 건조한 입술 끝에 물려 있었다. 소녀의 주머니에는 당연하게도 라이터가 존재했었고 당신이 건넨 그 모를 검은 호의에 소녀는 비릿한 표정을 지었다. 짓밟고 제 라이터를 꺼낼 수도 있었다.
불꽃 속에 춤추며 이미 반쯤 타들어 가는 재 덩어리를 죽은 눈으로 바라보다 소녀는 기만하듯이 다른 빈손으로 당신이 건넨 검은 불을 쳐내려 했다. 웅크려 앉아 고개를 어깨에 묻은 소녀는 당신을 올려다보며 비스듬히 웃더니 고개를 치켜들어 끝에 물린 담배를 당신께 직접 붙여달라는 듯 잔망스레 내미는 거다. 보통의 홍조 어린 소녀였으면 꽤 수줍게 보였을 만도 한데 너덜한 얼굴과 건조한 입꼬리는 퇴폐해 메마른 감정만 일렁인다. 그들의 눈높이 간극은 천장과 바닥. 혹은 그 이상.
제 것과 같은 것을 가진 당신을 보며 우연은 이미 선을 넘어 지나친 게 아니냐고. 결코 운명 따위의 극본같이 치졸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소녀라면 그 손에 으스러지는 것도 꽤 나쁘지 않으니 더 이상의 발버둥은 이쯤에서 관두고 싶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헤집어, 또 엉키고, 반복하고. -
602 이름 없음 (0606823E+5) 2020. 7. 25. 오후 2:38:31>>601
후득후득 하고 비는 그칠 줄 모른다.
그러나 차디찬 빗소리의 굉음으로 가득찬 귀가 멀어 고요했어야 할 소녀의 장례식에 때아닌 불청객이 하나 끼었다. 장례식이었어야 할 오늘의 장렬하도록 침울한 회색빛이, 우산을 들고 끼어든 어느 사람 때문에 영 제 빛깔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빛을 잃은 회색 사이로 화살 내리꽂히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두들기는 빗소리들마저 결국 귀를 멀게 할 만큼 차오르지 못하고 있다. 만종이 울리지 않고 있다. 빛 잃은 회색이라, 잘 되새겨보면 고약한 말장난이다. 회색에 잠긴 불청객이 뒤집어쓴 후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갈 곳이 없으면 비가 멎을 때까진 같이 있어줄게."
아무것도 아닌 0이라 하더라도 음수보다는 큰 수다. 자신이 내민 아무것도 아닌 손길 하나가, 텅 비어있는 삼십육 점 몇 도의 손아귀 하나가- 다른 모든 이들과 그렇게 별다르지 않을 법한 손길 하나가 소녀에게는 따뜻한 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아닌 듯한 회색의 그 사람에게 적어도 무언가 하나는 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불청객은 소녀의 장례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끝장을 내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있을 곳을 찾아보자."
그 사람은 소녀를 붙들고 있었다. 새까만 네 바퀴 쪽으로 발길을 뻗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눈을 감지 못하도록. 아량이라거나 동정심 같은 거창한 단어들을 갖다붙이기에는 그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훼방이었다. 그러니까, 그저 그것이었다. 쏟아지는 비들 사이로, 흐르는 세상 사이로 길을 잃고 떠돌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이 사람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낀 것이었다. 방랑자. 있을 곳 없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떨어져나온. 방랑자는 당신의 옆에 마찬가지로 쪼그려앉았다. 쪼그려앉아도 키 차이가 조금 났기에, 그 사람이 쪼그려앉았다고 우산이 소녀를 갑갑할 정도로 짓누르지는 않았다. 소녀가 바닥으로 쭈그려앉으면 방랑자 역시 쪼그려앉았고, 소녀가 일어서면 그 사람도 일어설 것이다. 아직, 손이 맞잡혀 있기에.
붙들린 쪽은 어느 쪽일까. 당신일까, 이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아직 불똥이 남아 있는 새까만 막대를, 소녀의 입에 물려 있는 막대 끝에 쿡 들이밀 뿐이다. 소녀의 품 안에 라이터가 있는 것은 모르고. 사실 그것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딴소릴 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형편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은 이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의 라이터는 그의 마지막 개비에 마지막 불씨 하나 심는 것을 마지막으로 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새로 산 라이터가 이 종이봉투 저 안쪽 깊숙이 어딘가에 잠들어있긴 한데, 한 손은 소녀에게 쥐어준 채로 다른 한 손으로 철철 비 쏟아지는 한가운데 종이봉투를 뒤질 깜냥은 없다. -
603 이름 없음 (0606823E+5) 2020. 7. 25. 오후 2:40:09# 내 쪽의 경우 일부러 성별에 대한 직접적 서술을 피하고 있는데, 참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줄게.
# 그리고 하나만 더... 안개낀 아침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 저녁노을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 -
604 이름 없음 (7151262E+5) 2020. 7. 26. 오후 4:18:51갱신☆
-
605 이름 없음 (0552798E+5) 2020. 7. 28. 오후 11:54:19자, 오랫만이야. 그간 말썽 하나 피우지 않고 잘 있었다면서? 잘했어. 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빠 죽겠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네. 2주 만이지? 그새 좀 마른 거 같다. 손 줘봐, 선물이야. 별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든 조개목걸이야. 생각보다 감성적이지? 근처에 바다가 있거든. 바다…본 적 없지? 언젠가…… (귓가의 치직거리는 잡음에 딱딱한 미소를 지어보인다.) 위엣분들은 바다 같은 데 관심없으시지. 시작하자. ……첫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능력을 사용한 건 언제야?
-
606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전 12:40:08>>605
(초점 없이 죽은 눈동자가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힘없이 당신을 향한다. 당신이 근황을 얘기해도 미동하나 없다 손을 달라는 말에 느리게 양손을 내민다. 철그럭.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마른 손목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능력 봉인용 수갑이 듣기 거북한 철 소리를 낸다.) ...... (손바닥 위에 올려진 조개목걸이를 보는 모습조차 인형처럼 무감정해 보인다. 그럼에도 시선을 떼지않고 있다가 시작하자는 말에 흠칫한다.) ........일..주일 전 쯤..... (확신이 없다. 주의 깊게 들어야만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다.) -
607 이름 없음 (8351716E+6) 2020. 7. 29. 오전 12:50:30>>606
(차트에 샤프펜으로 글자를 적어내려간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인지, 혹은 메모에 집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 화요일이니까 투약 테스트 때겠네. 최근 들어 네가 잘 견디는 거 같으니까 높으신 분들이 선물을 주고 싶어하더라고. 근데 또 똑같은 곰인형 같은 걸 주려하기에 내가 간신히 말리느라 진땀이, 어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오늘로 스케쥴을 당겼지. 갖고 싶은 거, 있어? 이걸 두번째 질문으로 하자. (치직거리는 잡음을 무시하곤, 당신을 향해 방긋 웃는다.) -
608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전 1:02:07>>607
(당신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이 침묵을 채워준다. 조개목걸이가 올려진 양손이 낯선것처럼 무릎 위에 올려져있고 시선은 여전히 그것을 내려다 보고있다. 당신의 말을 듣는건지 아닌건지 알수없을 정도로 고개만 숙인채 미동하나 없다가 당신의 두번째 질문에 시선이 느리게 위로 올라온다.) ............자유. (눈동자는 여전히 죽어있고 목소리는 힘없지만 대답만큼은 진실되었다.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헛된 희망을 대답한다.) -
609 이름 없음 (7724541E+5) 2020. 7. 29. 오전 1:10:17>>608
(사각. 펜끝이 불쾌한 소음을 남기고 멈추었다. 아무리 당신이 작은 목소리를 낸다 한들, 그 내용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말을 한 것이겠지만은. 귓가의 잡음 역시 멈췄다. 관자놀이로부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요한 감옥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바다 영상을 가지고올게. 직접 찍은 걸로. 아까 나 혼자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내 여동생이랑 같이 모은 거거든, 그거. 알지? 내 동생 이름, 블루인거. 바다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야. 너처럼. (눈을 내리깔고, 당신처럼 작은 목소리로 답한다.) 바다한테는 자유가 필요 없어. 넌 자유, 그 자체니까. …세번째 질문. 이건 의례적인거니까 평소처럼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연구소 방화사건, 당시 기억나는 게 있어? -
610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전 1:25:55>>609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이어져도 여전히 미동하나 없이 당신을 바라본다. 모든 감정이 죽어버린 인형처럼. 살아있지않은 것처럼.) ........... (당신이 화제를 바꾸어 하는 말을 조용히 듣는다. 하지만 나는 바다도 아니고 자유도 없어. 나는..... 생각이 이어지던 중 세번째 질문이 들려오자 다시 흠칫한다. 무감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나타나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새파랗게 질려가고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리고 온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젓는다. 철그럭. 움직임에 수갑에 연결된 쇠사슬이 몸을 둘러싼다.) 모..모...몰라......난 아..아무것도 몰라요...... (대답을 거부한다. 평소처럼.) -
611 이름 없음 (5384989E+5) 2020. 7. 29. 오전 1:33:12>>610
괜찮아. 진정해. 심호흡하자, 우리. (벽면 쪽에서 이쪽을 향해 기울여지는 기관총 터렛과 감시카메라의 쇠 마찰음을 무시한 채, 당신의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려준다. 안심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이 질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 당신을 위로하며 손목 시계를 확인한다. 남은 시간은 40분. 당신이 볼까, 애써 미소를 지어보인다.) 이제 질문은 없어. 시간이 남는데 저번 만남 때 했던 것처럼, 놀이를 할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건 지금 지켜보는 이들도 알고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이유는 단순히 동정심일까? 그건 아니겠지.) 아니면…역으로 해볼까? 질문 놀이를 하는거야. 내가 아닌, 네가 나한테. -
612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전 1:45:43>>611
(당신의 손이 어깨에 닿자 두려움에 놀란 것처럼 크게 흠칫한다. 덜덜덜 떨리는 몸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는다. 애써 당신의 말을 따라 심호흡을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않아 미소짓는 당신을 간신히 볼까말까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당신의 말을 듣고는 있는듯이 점점 몸의 떨림이 진정되어간다.) ........질문 놀이...? (느리게 당신을 바라본다. 여전히 초점없이 죽은 눈이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놀이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않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다. 잠시 생각해보는듯 손에 쥔 조개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시선은 여전히 고정한채 조용히 묻는다.) -
613 이름 없음 (6770356E+5) 2020. 7. 29. 오전 2:15:59>>>612
바다는……바다는 말야. (잠시 말을 삼켰다. 긴장된다거나 무서워서가 아닌, 옳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조개목걸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그것을 가져갔다.) 푸른색 물감을 잔뜩 뿌려놓은 것 같아. 햇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오기도 하지. 거기에 발을 담구면 간지럽히기도 해. (꿰어진 조개 중, 소라껍질 쪽을 당신의 귓가에 가져다댄다.) 눈을 감고, 잘 들어봐. 파도소리가 날 테니까. …종종 힘들 땐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 밖에 없어서 미안해. (힘없이 손을 내리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을게! 딱히 결말이나 흐름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이어주었으면 해 ~.~ -
614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전 8:41:27>>613
(조개목걸이를 바라보던 죽은 눈동자가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자 그대로 느리게 따라올라간다. 약간의 당황이라도 할 법하지만 여전히 감정없는 인형처럼 당신을 바라볼 뿐이다.) ....... (당신의 설명을 듣다가 소라껍질이 귓가에 오자 흠칫한다. 그러나 당신의 말대로 느리게 눈을 감아본다. 처음 느껴보는 소리. ....이게 바다인가? 이게 파도소리인가? 말로만 들은 개념은 그 풍경을 그려내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잠시동안 아주 약간 긴장이 풀리는것 같았다. 그러나 귀에 들려오던 소리가 멀어지자 천천히 눈을 뜬다. 죽은 눈동자에 보이는 힘없는 당신의 모습은 닫혀있던 입술을 느리게 움직이게 한다.) ........왜...미안해요....? (질문 놀이의 두번째 질문. 당신이 나에게 그런것으로 미안해할 이유는 없을텐데도.)
#미안 어제 그대로 자버려서 지금 확인했다! ㅠㅠ 응응 나도 편하게 잇고있으니까 걱정마~ 흘러가고있는 상황이 흥미롭기도 하고 ㅋㅋㅋㅋ
#잇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성별이나 연령대 정해놓았니? 아님 여동생의 연령대라든가! -
615 이름 없음 (4300492E+6) 2020. 7. 29. 오전 10:57:51>>614
왜냐하면…… (말을 늘인다. 평범한 흰 벽면의 홀로그램 처리되어 이쪽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을 유리창 위치를 흘끗 곁눈질 하며.) 아까 말했지. 바다는 너라고. 넌 뭐든지 가능한, 그 어떤 인간보다 자유로운 존재야. 저들이 너한테 초월자느니, 우주의 이해에 닿은 자라느니 부르는 말들은 무시해버려. (귓가의 잡음이 심해졌다. 아마 나도 쉽게 여길 빠져나가진 못하겠지만. 당신의 양 어깨를 탁 붙잡는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간절함을 담은 시선으로, 당신의 죽은 눈과 눈을 마주친다.) 너는 바다이자 파도야. 지금은 잠깐 육지에 거슬러 올라왔을 뿐이지만, 곧 어느 곳보다 넓고 새로운…… (거기까지 말했을 때, 뒷쪽 벽면인줄로만 알았던 곳에 문이 생겨나고 중무장의 보안요원들이 박사 한 명을 중간에 끼고 뛰어들어온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에게서 손을 떼어내고 순응의 의미로 양손을 들어보이며 뒤돌아섰다. 그러기 전에 당신의 귓가에 속삭인 말은 자신의 뇌리에서도 맴돌았다.) ‘……너의 진짜 이름은 숫자가 아닌, 화이트야.’(그 뒤론 당신을 돌아볼 기회도 없이 연행을 당하듯이 밀쳐지며 방을 빠져나가게 됐다. 당신은 또다시 혼자가 된다.)
#어제 내가 너무 늦게 이어서 피곤했겠다 8ㅁ8 괜찮아!
#그것도 염두에 두진 않았는데...남동생/여동생에서 많이 생각이 갈렸는데 여동생이면 남성에 20대 후반으로 설정하고 싶어! 여동생의 연령대는 10대 초반에 이미 사망했다는 설정이야. 말해주진 않았지만...? -
616 이름 없음 (1990833E+5) 2020. 7. 29. 오후 12:23:45>>615
(시선은 당신에게 고정시키고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에게서 세뇌를 당하듯이 주입되어왔던 호칭들이 들려오자 얼굴이 다시 새파랗게 질려간다.) 아냐.....아냐.....나, 나는.....나는..... (시선이 마구 흔들린다. 수갑을 찬 양손을 올리며 몸을 웅크리지만 당신이 어깨를 잡으며 눈을 맞추자 공포에 젖은 죽은 눈만이 당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고는 정지. 보안요원들과 박사가 들어오지만 평소처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반응도 없이 연행되어나가는 당신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아.....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여전히 머리에 맴돌았다. 나는, 나는, 내 이름은... 점점 표정이 일그러진다. 공포의 감정만은 아니었다. 그저, 숨이 막히고, 혼란스러운 기억들과, 머리가 깨질것 같은 고통이, 나를, 나를..!!) 아아아아악-----------!!!!! (목이 찢어질듯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수갑을 찬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다. 여태껏 보이지않던 커다란 반응. 고통스러운 머리를 바닥에든 벽에든 찧으려는듯이 발버둥치자 거대한 수갑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아냐! 재밌어서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이었거든 ㅋㅋㅋㅋ 괜찮아!
#그랬구나 여동생이 이미 사망했다니..... 88ㅁ88 사실 연령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느라 물어봤어. 답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미 화이트에 대해서 정해진 설정이 몇 있는것같은데 물어봐도 될까? 능력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생각하고있던 연령대같은거? 처음에는 연구소 방화사건이라길래 불이나 폭발 관련 능력을 가지고있는줄 알았는데 바다라고 그래서! :) -
617 이름 없음 (9201933E+5) 2020. 7. 29. 오후 9:19:54>>616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입술 안을 억지로 씹어 웃음을 참고, 그렇게 당신이 있는 방 앞에 섰다. 보안 요원은 뭔가 말해주려는 듯 보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 조용히 날 보내줄 뿐이었다.) ……. (저번보다 당신을 옭아매고 있던 구속구가 많아졌고, 미처 지우지 못한 핏자국이 벽 군데군데 보였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당신.) 말썽쟁이 두 명이 모였네. 잘 지냈어? 2달 만이야. 기억이 희미하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할까? (그간 당신도 많이 변했듯, 자신 역시 변한 점이 있었다. 왼쪽 눈엔 흰 안대를 차고 있으며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었다. 옷도 긴팔과 긴바지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퀭해지고 야윈 느낌을 받곤 했었다.) …어떻게 지냈어?
#퇴근하고 왔어! 나도 재밌어서 계속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 같아 ㅠㅠㅠ
#능력이나 정체, 연령대, 그리고 방화사건이랑 바다 같은 키워드들은 어떤 의미를 지녔다기 보다는 이어줄 상대가 설정짜기 쉽게 폭넓게 지칭한거라서 막 생각해둔건 없어(ㅋㅋㅋ ㅠㅠ) 초기에 생각한 초월자는 신체복구 및 치유랑 신체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히 높다? 라는 느낌으로만 생각했었어! 폭주라는 개념도 괜찮고, 추가적으로 불 능력을 써도 괜찮고?? 인간에게 묶여있는 초월적 존재를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시작해본거라서 추가하고 싶다거나 빼고 싶다면 편하게 해도 괜찮아!! ~.~ -
618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후 10:22:44>>617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시간이라는 감각은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였으니. 기억하는것은 끊임없는 실험과 주사와 약과 구타 뿐. 그 밖의 기억은 그것들 때문에 흐려져버려 이제는 지친듯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수많은 구속구에 묶여있다. 방금 전까지도 실험이라는 이름 하의 폭력에 시달렸는지 얼굴을 포함한 옷으로 덮이지않은 온몸은 능력으로도 아직 다 회복하지못한 피와 상처들로 뒤덮인 채.) .......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미동없던 몸이 구속구로 철그럭거리며 천천히 반응한다. 느리게 들어올린 얼굴. 저번보다도 더 감정이 죽은 눈빛으로 당신을 고요히 바라본다.) ........누..구....세요....? (갈라진 목소리. 기억도 희미해지고 당신의 모습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것 같다.)
#어서와 수고했어! 재밌다니 다행이다 ㅋㅋㅋㅋ 나도 재밌어서 계속 이 생각만 했어 ㅠㅠ
#아 나도 처음에 신체복구나 치유같은 능력도 생각했었어 ㅋㅋㅋㅋ 그래서 갇혀서 폭력을 당하면 회복하는 실험 및 연구에 이용당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초월적 존재니까 그냥 신체복구+치유+불 능력으로 다 해야겠다! 하지만 화이트는 자신이 초월자라는건 모르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있는 상태라고 할게~ -
619 이름 없음 (8351716E+6) 2020. 7. 29. 오후 10:42:07>>618
이런, 원래도 인상이 희미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난처하게 웃는다. 당신의 몸에 난 상처들이 자가 수복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구석에 있는 삐그덕거리는 철제 의자를 끌고와 당신의 앞에 두고, 그곳에 앉았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당신과 마주보며 한참 동안이나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때처럼, 고요함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당신의 어깻죽지로부터 떨어지는 혈액처럼 서로의 생각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너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게 있어. 블루는……블루는, 투병중이었어. 혈액이 혈관 내에서 젤리처럼 굳었다가, 뜨거워졌다가, 가시 돋혔다가…그 아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랬지.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고통이었지만, 그 바보는 언제나 괜찮다는 듯이 웃고, 같이 해변을 산책했었어. 윗분들의 눈에 든 덕에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나아질 수 있었거든. (많은 것이 함축된 미소로 마주보다,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았다.) 선물해준 목걸이는 아직 갖고있으려나?
#응응 진행하다가 나도 그렇고 필요하면 설정 넣어도 괜찮아! 과다이다 싶을 정도로 마구마구 버무리자(?) ㅋㅋㅋㅋ -
620 이름 없음 (1390901E+6) 2020. 7. 29. 오후 11:25:23>>619
(당신을 죽은 눈동자로 계속 바라보지만 여전히 기억은 희미할 뿐이다. 머릿속은 언제 당신이 나에게 해를 가할까하는 생각만 가득했다. 그동안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그러했으니. 하지만 당신은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 침묵할 뿐이었고 그런 당신을 지켜보는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없었다. 고요함만이 가득하던 찰나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블루.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으윽.... (머리가 아파와 낮게 신음한다. 당신의 미소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찰나 목걸이라는 단어에 신음을 멈춘다.) ....목걸이...? (무언가가 떠오른듯 당신을 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푹 내린다.) .....조개....목걸이....... 부서졌어요...... 부서졌어...... (당신이 오지않은 동안 받았던 폭력과 능력 폭주의 여파로 손에 쥐고있던 목걸이가 산산조각이 난것 같았다. 죽어버린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욱 부자연스럽게 감정이 죽어버린듯한 모습이었다.)
# 좋아! 설정 과다라도 지금처럼 재밌으면 난 좋아 ㅋㅋㅋㅋ 그래도 서로 잘 맞는것 같아서 다행이야! -
621 이름 없음 (8351716E+6) 2020. 7. 29. 오후 11:45:15>>620
괜찮아. 조개 목걸이에는 바다의 수많은 요소 중 파도 소리만 있을 뿐, 바다 자체가 담겨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뭘 하던 간에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작고 사소한 것의 일부일 뿐이야. 그리고 조개 목걸이는 다시 만들면 돼. (당신이 시선을 내리고 피하더라도 언제든지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선을 맞추려한다. 약물 중독이 치유되기도 전에 주사를 때려넣은 모양이지. 마음을 가라앉힌다. 실패하면 안되니까.) …저번에 질문 게임을 할 때, 나한테 물어봤었지.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 아직 네 안에, 조금이나마 이 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잠깐의 침묵. 첫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이다. 당신의 의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포기하면 안돼. 내리막길이라는, 지금 당장만 편해지는 길을 택하고 택하다보면 어느새 길은 점점 아래로 쳐지기 시작해 결국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블루가 그랬지. 아직 네 안에 그 당시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바다를 직접 보고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바다가 보고싶다고, 말해줄래? (주머니 속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진심을 다해 말한다.)
#맞아 잘 맞는 상대 찾기 정말 어려운데 @ㅁ@ 너무 기쁘다 엉엉 -
622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전 12:10:37>>621
하..지만.... 첫 바다...였는데.....첫 파도소리였는데.... (여전히 시선을 내리고 중얼거린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 귀를 기울이지않으면 듣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래도 부자연스럽게 고요한 그 목소리의 내용은 무감정해보여도 아직은 희미하게나마 감정이 존재하는것 같았다.) .........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당신의 말을 듣는건지 아닌건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또다시 블루의 이름이 들려오고 당신이 희망과 바다를 말하자 느리게나마 반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철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당신을 바라보고, 침묵. 감정이 죽어버린 눈동자가 당신의 눈을 멍하니 마주본다.) .........바..다...... (흘러내리던 피가 어느새 서서히 그쳐간다. 희망은 죽었더라도 자유에 대한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희망이 될수 있다면, 바다가 희망이 될수 있다면,) .........바다.... 보고싶어요. (나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것이다.)
#나도! 잘 맞는 상대를 만나서 정말 기뻐 ㅠㅠㅠ 앞으로의 전개도 궁금하고! -
623 이름 없음 (9585E+53) 2020. 7. 30. 오전 12:37:15>>622
(아마 높으신 분들은 무슨 대화인지 종잡을 수 없겠지. 하지만 그걸로 좋다. 어차피 모 아니면 도였으니까. 바다가 보고싶다고 말하는 당신을 향해, 활짝 웃어보인다.) 다행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의 표정으로 돌아와, 평소 하던대로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CCTV 화면과 음성이 대신 흘러나가고 있을 터이다. 첫번째 버튼을 작동시킨 뒤, 자리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문 쪽으로 걸어갔다. 감시 카메라엔 가짜 영상이 비치고 있을테니, 기폭 장치를 설치해둔다. 그리고 다급히, 당신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하나뿐인 눈으로, 당신과 시선 높이를 맞춘 채 마주본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해. 너를 거둬들이겠다는 초월자 무리 중 하나가 날 찾아왔어. 그녀가 직접 올 수도 있었지만, 네가 휘말려 죽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나한테 시킨 거야. 초월자는 초월자만 죽일 수 있거든. (눈동자에 이유 모를 슬픔이 깃든다.) 먼저 수갑을 풀어. 윗쪽 감시카메라 뒷편에 환기구가 있어. 카메라를 부수자마자 저쪽에서 알아챌 거야. 환기구를 타고 이 지도를 보고 이동해. 하수처리 시설을 타고 나가면, 바다에 배가 하나 있을거야. 그걸 타고 나가면 돼. 그리고… (당신에게 지도와, 저번 것보단 미완성이라 부를만한 엉망인 조개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마저 완성시켜줘. 블루도, 화이트도, 그럴 수 있는 아이니까. (둘 다,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웃고있지만, 하나뿐인 오른쪽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뚝뚝 떨어진다. 당신의 손을 꼭 마주잡아.) 잊지마. 바다는 네 안에 있어. …먼저 가. 뒤따라갈테니까.
#으아앙 ༶ඬ༝ඬ༶ 그러게 앞으로 전개랑 마무리가 궁금해...! -
624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전 12:58:14>>623
(당신은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못해 당신을 여전히 멍한 눈동자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설치하고, 다급히 다가와 설명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런 당신의 설명을 듣는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슬퍼보이는 당신의 눈동자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렇게 당신을 보고있다보니 어느새 손에 쥐어진 아직 완성되지않은 조개목걸이. 엉망인 그 목걸이를 고요히 내려다보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자 다시 시선을 올린다.) ........아... (당신이 울고있었다. 여태껏 무감정하던 얼굴이 살짝 놀란것같은 표정으로 변한다. 마주잡은 손에서는 낯설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그 손을 같이 꼭 잡는다.) .....아...안돼..요......같이..... (같이 탈출하자는 것인지, 조개목걸이를 같이 완성시키자는 것인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본능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당신의 손을 계속 붙잡는다. 무의식적으로 치유 능력이라도 쓰려는 것처럼.)
#앞으로의 전개랑 마무리랑 다 새드일까봐 슬프다 88ㅁ88 다 플래그처럼 보여서 ㅠㅠㅠ -
625 이름 없음 (6010882E+5) 2020. 7. 30. 오전 1:15:05>>624
(손을 꽉 붙잡는 감촉에 미간이 일그러졌다. 꽁꽁 숨겨두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와 눈 앞에 펼쳐진 풍경마저 바꾸어놓을 정도였으니까. ‘항상 제멋대로야.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한창 블루를 위해 꾸역꾸역 일만 하던 시절, 내게 그런 말을 했었지. 투정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때보다 슬프고, 화나보였다. 화를 내는 상대는 내가 아닌 블루 본인이었음을 알기에 함부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지금의 난 또 제멋대로인걸까. 그리고 또 똑같이 후회를…….) 걱정 마. 난 정문으로 튀어나갈거야. 다 너한테 신경이 쏠릴 테니 난 거들떠도 안볼거야. 그 사이에 초월자 중 한 명이 날 지켜주러 와줄거야. 그러니 잘 도망가야해. 이 모든게 헛되지 않도록. (억지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며 힘겹게 당신의 손을 떼어놓으려 했다. 거짓말인게 티가 나지는 않겠지. 눈물을 팔로 슥슥 닦아내고, 뒤돌아서서 당신을 등진다. 동생에게 그랬듯, 당신에게도 든든한 사람이고 싶지만 떨리는 다리는 어쩔 수 없어.) 가자. 시간이 없어, 화이트.
#그러니까.....하지만.......맡길게...........(무책임) ㅋㅋㅋㅋ ㅠㅠ -
626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전 1:48:15>>625
(당신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당신은 단호하게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여전히 빛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않는다. 무의식적으로 초월자로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간파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당신이 손을 떼고 뒤돌아서는 모습 너머로 떨리는 당신의 다리를 발견한다.) .......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 그것을 내가 감히 간섭할수 있을까. 하지만......내가 정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월자라면. 우주의 이해에 닿은 자라면. .....그렇다면.) ........ (눈을 감자 손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손에 쥔 조개목걸이도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타오르는 불꽃은 수갑과 구속구들을 휘감아 가볍게 부숴버린다. 자유로워진 몸으로 천천히 일어선다. 그리고 당신의 뒷모습에 다가가서는 느리게 눈을 뜬다.) ......나는.....초월자. 우주의 이해에 닿은 자. ......당신이 살아남아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고요히 중얼거리고는 신체복구 및 치유의 보호가 걸린 조개목걸이를 당신의 목에 걸어준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최선.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당신 쪽을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담긴 눈동자로 바라보다가 마찬가지로 뒤돌아선다. 그리고 지도를 챙기고 당신이 말한대로 윗쪽 감시카메라를 불꽃을 날려 부수고 환기구를 향해 뛰어든다. 최대한 시선을 끌고자하며.)
#나도 고민했지만 모르겠어........힘을 써서 억지로라도 함께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은 굳게 다짐한 저 선택을 너무 간섭하는것 같아서 ㅠㅠㅠ 결국 초월자로서 최대한 버프(?)를 주고 다시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ㅋㅋ ㅠㅠ -
627 이름 없음 (5652321E+5) 2020. 7. 30. 오전 2:08:13>>626
(뒤에서 닿아온 따듯한 빛에 뒤를 돌아보지 않겠단 결심을 깨고 말았다. 따스하면서도,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빛에. 당신의 말을 멍하니 듣고나서는 그 감정이 담긴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조금 더 보고싶었지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행동으로 탈출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폭발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폭 장치를 작동시켜 문 역시 파괴시켰다. 폭발로 인한 잔해들과 먼지 사이로 들어서는 보안요원들 사이를 파고들어 달리기 시작한다. 총성이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는게 느껴질 정도로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있었다. 아까 당신이 준 빛 덕분인걸까.) 허억, 허억…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어느정도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후, 여유가 남았을 때 쓰려했던 기폭장치를 벽에 붙여두고 통신장치를 켰다.) …접니다.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15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숨을 고르며 통신장치 너머의 인물이 말하는 걸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아뇨.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불안정해요. 회수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여긴 저 혼자로 충분합니다. (벽에 붙여놓았던 기폭장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그걸 떼어냈다.) 처음 만나게 되면, 화이트라고 불러주면 될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통신 장치를 부수고, 다시 반대편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지휘통제실을 향해서.)
#아! 버프는 생각 못해봐서 과연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성격상 오히려 그 힘을 기회로 사용할 것 같아서 급 노선을 바꿨어 ㅋㅋㅋㅋ 이미 손을 떠나버렸어...! -
628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전 2:43:30>>627
(서로 아무 말도 하지않았지만 처음으로 감정이 담겨진 눈동자가 서로를 마주본것 만으로도 천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지체할 시간 없이 당신의 말대로 능력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뚫고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동안은 자유롭게 쓰지못하고 억제당하거나 폭주하기만 했던 능력이었지만 지금만큼은 그 어느때보다도 또렷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매우 높았다. 지도를 살피며 환기구를 타고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저 뒷편에서 또다른 폭발과 총성, 고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속도를 더 올려 기어나간다.) 하악....하악..... (물론 체력은 이미 떨어진 상태지만 여기서 멈출수는 없다. 당신. 이름조차 묻지못했던 당신이 마지막으로 전해준것 만이라도 어떻게든 달성해야...) ..!! (간신히 하수처리시설에 다다르지만 보안요원들과 정면으로 마주쳐버린다. 그동안의 트라우마로 공포감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어떻게든 도망치려 발버둥치고 불꽃을 휘날리며 달리기 시작한다. 바다, 바다로..! 아래에 철퍽거리는 물이 발을 무겁게 잡아끈다.)
#바로 기회로 사용하다니 멋지다! ㅋㅋㅋㅋ 잘된......거겠지...? 사실 돌리면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ㅠㅠㅠ
#답레를 늦게 확인했더니 시간이 너무 늦었네 ㅠㅠ 오늘은 여기까지 잇고 자러갈게! 잘자~ -
629 이름 없음 (7573364E+5) 2020. 7. 30. 오후 8:57:21>>628
그러고보니, 이름도 말해주지 못했네… (하지만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자신을 찾아왔던 그 초월자도, 내게 죽을 각오가 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에 망설임은 없었다. 하나뿐인 여동생, 블루가 없는 세상 따위 더 이상 살아갈 의미 같은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휘통제실 근처에 다다랐다. 모든 경비가 화이트를 쫓아간 만큼, 이곳도 허술해져 있을 터였다.) 후우……. (사실, 화이트를 만났을 때부터 느낄 필요 없을 감정을 느끼곤 했다. 어차피 자신은 무력하고,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 지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기에 그 초월자는 자신이 살아돌아오더라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 무참한 죽음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죽는 게 더 나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이트.) 잘 가고있길 바래. (마지막 바램을 읊조리고, 지휘통제실의 도어락을 해제한다. 그곳에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이 된 통제요원 두세명과 보안요원 한 명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려 하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몸을 날려, 보안요원에게 있는 힘껏 몸을 부딪혔다. 뒷쪽 벽에 잘못 부딪힌 보안요원의 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후, 좋아…이제부터 잘 들어. 다들 이곳에서 꺼지…윽! (방심하던 사이 뒤통수에 철제의자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기폭 장치가 저 멀리 날라가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진다.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점점 멀어져간다. 이마에서 뜨듯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진다.) ……블, 루…, 화이트. (폭탄을 향해 뻗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진다.)
#퇴근하고 왔어! 그러게 진짜 어떤 마무리가 될까 ㅇ.ㅇ...!? 필요하면 다른 초월자 역할도 자유롭게 해줘도 될 거 같아! -
630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후 10:15:23>>629
(달리고 또 달린다. 언제나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린다는 행동 자체가 힘겨워 그 자리에 쓰러져버릴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도망친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다. 바로 뒤에 쫓아오고있는 경비는 날 붙잡을것이고 20대 후반 정도의 그 남자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겠지. 그것만큼은 안되었다.) 하악....하악...! (드디어 저 너머로 빛이 보인다. 어두컴컴한 하수처리시설을 넘어 드디어 빛으로. 뒤를 돌아보고 쫓아오던 경비들을 향해 가장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꽃들을 마지막으로 쏘며, 그대로 빛을 향해 몸을 날린다.) ...! (쿠당탕. 그대로 한참을 데굴데굴 구른다. 충격에 그대로 엎어져있던 몸을 힘겹게 일으킨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새파란 광경. 익숙한 소리.) ....아아..... (바다. 바다가 눈앞에 있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바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차마 그것을 향해 다가가지도 못한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힘겨운 몸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떻게든 공격태세를 취하자 무감정한 눈을 제외하고 온통 검은 망토로 뒤덮인 그 사람은 시선을 마주친다.) "화이트." (익숙한 그 이름을 듣고 흠칫한다. 그러나 초월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계속 말을 건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너를 회수하러 왔단다. 가자." (그 뒤로 보이는 커다란 배 하나. 저것을 타면 이곳을 탈출할수 있는걸까. 하지만 아직은 이대로 갈수 없었다.) ...하..지만 저 안에....먼저 가면 뒤따라온다고....! 같이 가야해..요... (당신을 두고갈수는 없었다. 하지만 초월자는 무감정하게 내려다볼 뿐이다.) "어차피 그는 살수 없어. 그래도 그가 보고싶니? 그렇다면 한번 불러나보려무나. 그가 들을수 있을리는 모르겠지만." (초월자는 망토 안에서 한손을 들어올린다. 그러자 머리가 찢어질듯한 고통 뒤로 당신과 텔레파시로 연결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몰라 머뭇거리다가 결국 당신과 내가 연결된 이름을 불러본다. 당신의 마지막 말처럼.) ...블, 루.......화이트.
#어서와! 함께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ㅠㅠ 그래서 일단 불러보는 쪽으로 썼어! 화이트는 상황을 모르니까...
#쓰다보니 다른 초월자도 필요할것같아서 등장시켜볼게! -
631 이름 없음 (1771737E+5) 2020. 7. 30. 오후 10:45:03>>630
(끊어진 의식 속,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로소 마음 속의 짐이 덜어진 느낌이 들었다. 단지 아쉬운 건, 보고싶은 얼굴들의 모습이 없다는 것 뿐일까. 그래도 괜찮다. 할 만큼 했으니까. 텅 빈 허공을 응시하던 눈을 천천히 감으려던 찰나─) ……화이트? (놀람에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잘못 들은건가 싶었지만, 희미한 정신의 끈이 이어진 것이 느껴진다. 이것도 초월자의 능력인걸까, 아니면 죽기 전의 환청인걸까. 한참을 고민하다 힘없이 미소지었다. 아무렴 어떨까.) 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네. 그럼 좋겠는데. 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 블루와 너한테 제대로 속죄하고 싶었는데,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네. (숨을 고른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했나? 바다는 어때? 설명해줬던 것보다 더 예쁘지? 들어갈거면 수영은 제대로 배우고 들어가야해. 빠지면 큰일나니까. 초월자니까 괜찮으려나. (아무 이야기나 마구 흘러나온다. 입으로 내는 게 아닌, 그저 생각하는게 닿을 뿐이니까.) 언제나 네가 고통받는걸 방관해서 미안해. 블루를 잃었던 만큼, 너라도 살리고 싶었어. (눈을 다시금 감는다.) 그러고보니 내 이름을 말해주지 못했네. 마지막일테니 말할게. 내 이름은… (작게 읊조렸다.)
#생각해보니 내가 화이트 이름을 지어줬으니, 반대로 하는게 밸런스가 맞으려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워두었어!ㅋㅋㅋㅋ 다른 초월자도 자연스럽다! -
632 이름 없음 (6430497E+5) 2020. 7. 30. 오후 11:24:22>>631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도라는 감정이 얼굴에 약간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늘 그랬다. 당신은 얘기하고, 나는 듣고. 당신은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해준다. 그 흐름이 당신이 생각이 떠오른대로 말해주는거라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계속 조용히 당신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당신을 부르지않으면 당신이 이대로 눈을 감을거라는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당신을 부른다.) .....네이비. (초월자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아차린걸까. 스스로 의식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는 그런 자신에게 놀란다. 나는 정말로....초월자가....) .....지금 어디에요..? 뒤따라온다고......했잖아요. (아직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다. 그러나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당신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조개목걸이.....완성시켜야 하잖아요. 여기 바다에서.... 그게 네이비의 역할이자 블루와 나에게 속죄할수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걸까. 죽어있던 눈동자가 바다의 푸른빛을 담는다.) .....오지않을거에요..? (무감정한 목소리지만 어쩌면 당신에게는 어떤 감정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름을 고민하다가 나름 블루랑 바다랑 관련있는 네이비로 했어! ㅋㅋㅋㅋ 초월자도 자연스럽다니 다행이네! -
633 이름 없음 (0356332E+5) 2020. 7. 30. 오후 11:44:26>>632
(잠시 말이 없어졌다. 말한 적 없는 이름을 불렸다거나 생각이 많아졌다거나 하는 복합적인 이유에서였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당신과 깊은 연관을 지을 생각은 없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있는 그대로의 말을 내뱉고마는 걸까.) 어째서 이렇게 날 찾는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화이트에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살아 돌아간다 한들 옆에 있을 초월자가 날 용서하지 않을거야. 네게 그만큼의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당신의 옆에 서있는 초월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래도, 덕분에 힘을 입었어. 고마워. 마저 할 일이 있다는 걸 떠올렸거든. (당신의 마지막 말에 짧게 침묵했다. 난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목소리에는, 마치 바다같은 포용력이 담겨있었기에 무심코 헛점 가득한 대답을 해버릴 뻔 했다.) 정말 파도 소리가 들리네. 같이 보고 싶었는데. 가고 싶지만 내가 있을 자리는 그곳에 없을거야. 모처럼 화이트가 준 힘도 다한 것 같아. (푸스스 웃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려줄래. 바다를 본 감상을. (손을 뻗어 기폭 장치를 쥐었다.)
#네이비 좋은 이름이야 ⊇□`。 ㅠㅠㅠ -
634 이름 없음 (6010011E+5) 2020. 7. 31. 오전 12:15:25>>633
(언제나 들었던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것도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다시 듣는다. 잠시 초월자와 똑같은 표정으로 초월자와 눈을 마주치다 다시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용서는 죄를 짓게 된 그 당사자에게서 받아야하는거잖아요. 네이비는 나를....도와줬는데... (그리고 그 당사자는 나인데도. 어차피 살수 없다는 말이 이 뜻이었나. 잠시 같은 침묵이 흐르지만 당신은 다시 나에게 말을 건다. 마지막 질문 놀이일까. 바다 저 너머를 바라보던 고요한 눈동자는 그대로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멈춰있던 두발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파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맨발이 모래를 사박사박 밟다가 밀려오는 물에 처음으로 닿게되자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느껴본다. 발목을 간지르는 파도를 고요히 내려다본다.) .....바다... (중얼거리며 멈춰있다가 다시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더 깊이, 더 깊이. 초월자의 시선도 신경쓰지않고.) ....차가워요. 아름다워요. 넓어요. 자유로워요. 살아있어요. (생각이 그대로 나온다. 간단한 단어들뿐이지만. 걸음을 멈추지않는다. 더 깊은 바다로. 더 깊이, 더 깊이.) 네이비. 자유로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당신에게 하는 말일까. 바닷물이 점점 차오른다.)
#좋아하니 다행이네! ㅋㅋㅋㅋ 마지막은 바다를 본 감상과 네이비에게 자유롭다고 살아있으라고 하는 중의적 표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ㅠㅠ -
635 이름 없음 (6162327E+5) 2020. 7. 31. 오전 12:41:56>>634
(그래, 난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 블루에게도, 화이트에게도. 그저 멋대로 행동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 뿐. 그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무력함 때문이라고 되뇌어왔다. 실은,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인데. 당신의 감상을 듣다보면, 서서히 당신이 느끼는 대로의 감촉이 전신에 전염되어왔다. 차갑고, 아름답고, 넓고, 자유롭고…….) ……그런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마치 자신이 당신에게 말했던 것 같아, 힘 빠지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소리가 차차 멎어들고, 고문 때 뺏겨버린 눈 쪽의 붕대가 스르르 풀어졌다. 양쪽의 시야가 흐릿하게 번져나간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도, 화이트도…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줘.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바다는 언젠가, 이어지게 되있으니까. (의식 속의 나는 눈을 감고, 현실 속의 나는 눈을 뜬다. 머리로부터 느껴지는 둔탁한 고통이 정신을 확 낚아채듯 돌려놓는다. 손을 뻗어 잡았던 기폭 장치 버튼 위에 손을 놓고, 주머니에서 폭탄을 힘겹게 꺼내 엔진 쪽을 향해 내던졌다. 살아남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저.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싶었는데. 던져진 소형 폭탄은 궤적을 그리며 엔진 쪽으로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은 채 버튼을 눌렀다.) ─. (그 뒤로 이어진 것은 폭발. 폭발. 폭발. 섬 한가운데에 있던 비밀연구 시설은 커다란 굉음과 함께 지하부터 지상까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더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의적 표현 너무 좋다ㅠㅠㅠㅠ 보면서 어쩐지 화법이 네이비한테서 배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가슴이 찢어진다 o<-< -
636 이름 없음 (6010011E+5) 2020. 7. 31. 오전 1:18:20>>635
.......네이비만 나와 대화해줬어요. (당신의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갇혀있는 동안에는 오직 폭력뿐이었으니.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바다는. 바다는.....) "그만." (당신과의 연결이 끊겼고, 어느새 옆으로 이동해온 초월자는 나의 팔을 붙잡는다. 그 때문에 더 깊은 바다 속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무감정한 표정으로 초월자와 서로를 고요히 바라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발. 그것이 모든 연구시설들을 무너트리기 시작한다. 바다를 보던 고요한 눈동자에 그 모습이 비춰진다. 저 안에는 당신이 있다. 그런데..) "너는 회수되어야 한단다. 이런 바다는 허락할수 없어. 너는....." (초월자의 목소리는 더이상 들려오지않는다. 그냥 가라앉고싶은데. 이 바다 안에 녹아버리고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것들이 무너져내리는것을 보면서 깨닫는다. 나는 여전히 자유로울수 없구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어서 가자꾸나." (초월자의 손에 이끌려 바다에서 배로 올려진다. 물에서 건져진 인형처럼. 바다의 빛을 비추던 눈동자는 바다에서 멀어지자 다시 죽어버린다. 감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은 계속 무너진 폐허만 바라본다. 눈물 한방울조차 흘리지않은채. 인간을 벗어난 존재인 초월자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초월자는 만족한것처럼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고동소리가 들린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ㅋㅋㅋㅋ 대화한건 네이비가 유일해서 그렇지않았을까 싶어! 그치만 결국 이렇게 되는걸까.... ㅠㅠ -
637 이름 없음 (8924123E+5) 2020. 7. 31. 오전 1:34:23>>636
[■■■■제도 초월자 감금 및 연구 시설 파괴공작 관련 보고서]
XXXX/XX/XX. 작전기간 총 51일 소모.
결과, 초월자 관련 연구 내용 전 파기를 확인. 시설 관련 생존자 없음.
초월자 1명 구출 성공. 상태, 이상없음. 1차 인지 완료, 2차 인지를 앞둔 상태. 협조적이나 의지 부족.
본 작전은 비초월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짐. (이하 관련 내용은 ‘네이비 샤인’ 항목 확인. p20)
생사 확인 불명. 영향 없음으로 판단. 이상.
(폭발의 중심부. 회색의 잔해물들이 널려있다. 주변의 나무들 역시 폭발의 여파로 꺾여있거나 뿌리채 뽑혀져나가있다. 야생 토끼 중 하나가 유유히 건물 잔해 위를 깡총 뛰어가던 도중, 밟고있던 바닥이 흔들렸다. 토끼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고, 잔해는 느릿느릿 흔들린다. 툭, 툭. 쿵. 덮혀져있던 잔해 하나가 뒤집히고, 먼지투성이의 팔이 튀어나왔다. 햇빛을 받은 손 한 쪽은 잠시 그 빛을 쥐려는 것처럼 주먹을 쥐었다가, 곧 힘없이 축 늘어진다. 잔해에 늘어진 손가락에 힘을 주듯 손을 모은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4개의 손가락이.)
#라는 것으로 엔딩을 내면 될 것 같아! 정말...정말 오랫만에 상판에 들러서 무작정 아무 생각없이 시작해본건데 너무 재밌게 잘 이어줘서 고마웠어 (;﹏;) 화이트라는 캐릭터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정말 오랫만에 심장이 두근거렸던거 같아 ㅋㅋㅋ 늦은 시간까지 이어주느라 수고했어! -
638 이름 없음 (6010011E+5) 2020. 7. 31. 오전 1:45:21>>637
#엔딩마저 끝까지 두근거린다.. 열린 엔딩이라서 여러가지가 상상되고 ㅠㅠㅠㅠ 나도 재밌는 상황이나 설정도 제시해주고 잘 이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 뒤의 이야기나 이전의 네이비랑 화이트의 이야기도 궁금하고 그래서 더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해서 아쉽기도 하네.... ㅋㅋㅋㅋ 아무튼 나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주느라 수고 많았고 고마웠어! -
639 이름 없음 (y3Cbdm4402) 2020. 8. 1. 오후 10:37:39“나 기억함니까? 기억해? 나 해용. 장 해용.”
금발의 남성이 대뜸 헤실헤실 웃으며 같은 과실에서 나온 당신을 향해 말을 걸어왔다.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 그리고 말투는 아무리 봐도 외국인의 말투처럼 어눌하다. 요즘같은 시대에 수상하기 짝이 없지만, 당신을 향한 반가움이 거짓 같지는 않다. 양팔을 확 펼치고 다가가려다, 엉거주춤 고장난 로봇처럼 물러섰다.
“아, 이런거 싫어함니다. 맞아…암튼 방가워. 완전 오랫만!”
#유학간 꼬꼬마 시절 친구+짝사랑이 하고싶다...........기억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
640 이름 없음 (GkI47QHACc) 2020. 8. 2. 오전 2:06:38>>639
그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앞을 향했다. 늘 휴대하는 은은한 골드 색상의 태블릿 화면이 그녀의 온 신경을 앗아간 터라 주변의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은 채 공고 사이트의 스크롤을 신경질적으로 넘기다가 시원한 카페라도 들어가려 고개를 두리번 거리던 찰나, 웬 남성이 자신에게 와서 대뜸 말을 건다.
" 뭐라는 거야."
기억? 장해용? 모르는 남성이 말을 걸자 잔뜩 긴장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긴장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 되려 오만하고 건방진 비웃임이 새어 나갔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하고 퍼뜩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늦었다. 신경질적이고, 차갑고, 딱딱하고, 오만한 사람. 겉보기에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그저 어눌한 말투와 그의 손짓이 재밌어 순수하게 웃었다..라, 정말 원망스러운 방어기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치고 그녀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그렇기에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 사람 잘못 보신거 같은데요."
취업도 못한 주제에 퍽 사무적인 말투가 그녀의 입에서 튀어 나간다.
#나이대는 20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나는데 맞을까? 너무 까칠하게 이은 건 아닌가 걱정되네.. -
641 Rx Medication (E2TMZgOV6o) 2020. 8. 2. 오전 4:07:03viagra without a doctor prescription
See Here Now
best place to buy generic viagra online -
642 이름 없음 (QHyNBDP6q2) 2020. 8. 2. 오후 6:15:57갱신!
-
643 이름 없음 (QHyNBDP6q2) 2020. 8. 2. 오후 9:52:11"야 소문 들었어?"
흑단같은 머리에 웨이브를 넣어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그녀는 딱 봐도 학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장 화려하게 꾸민 것처럼 보였다. 뽀얀 피부에 은은한 음영이 진 눈망울은 모두 티 안나는 화장으로 얻어진 것이었고, 귓볼에 있는 투명 귀걸이가 " 주말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귀걸이를 차고 말테다."하고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 친구들에게 하루에도 열 번씩 대학가면 핑크색으로 염색할까 보라색으로 염색할까 묻는게 일상인 그녀에게 우중충한 하늘색의 하복 셔츠는 지나치게 수수해 보였다. 아무튼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다른 반 남자애를 찾아가 다짜고짜 위처럼 물었다.
" 말도 안되지 않아?!"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소리를 치다가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는 어깨를 으쓱하자, 달콤한 과실향을 풍기는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흔들렸다. 조용한 쉬는시간 같았지만, 사실 주변의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그녀와 남자애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살짝 위로 올라간 눈꼬리로 모두에게 경고하듯 흘기며 주변을 둘러본 그녀가 속삭였다.
" 난 너한테 고백한 적 없단 말이야..!"
#뭔가 파란만장하고 우당탕탕한 청춘물이 보고 싶어서..! 나이대는 고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아무렇게나 즐겁게 이어줘:3
-
644 이름 없음 (8zp3lggK9U) 2020. 8. 2. 오후 10:28:51>>643
''이번주의 신곡 탑 10'을 재생시켜둔 이어팟을 귀에 꽂은 체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는 갑작스레 코 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과실향에 책상으로 향해있던 시선을 위로 향했다.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트린 그녀를 보며 그는 잠시 상황 파악을 하듯 천천히 귀에서 이어팟을 빼내며 머리를 굴린다. 무엇이 말이 안된다는걸까 고민하던 그는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를 보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 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고백해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거야? "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그녀를 따라 속삭이듯 물은 그는 주변에 자신과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확인하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듯 한숨을 푹 내쉰다. 그렇지만 꽤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듯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보이더니 살며시 그녀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다.
" 일단 둘만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해봤자 소문이 더 커질 뿐이야. "
그녀를 설득하듯 칠흑같이 어두운 검정색 눈동자를 마주한 체 부드럽게 속삭였고, 대답을 기다리듯 자그마한 입술을 닫은 체 그녀를 바라보았다. -
645 이름 없음 (QHyNBDP6q2) 2020. 8. 2. 오후 10:42:29>>643
느릿한 그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속터지게 했다. 물론 그녀는, 그가 단순 행동이 느린게 아니라 분명 뭔가를 생각하고 꽤 현명하게 행동하리란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눈 앞에 보이는 태도는 여유럽게 노래를 듣다가 이어팟을 빼내고 눈만 깜빡... 그녀는 아랫 입술을 살짝 깨물며 답답한 분통을 억눌렀다. 참자.
" 음... 사귀고 있다는 소문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라면 날 찰 것 같아 아니면 사귈 거 같아?"
이상한 질문을 하고 나서야 얼굴이 조금 붉어진 그녀는 꽤 단순한 편인듯 했다. 일단 뱉고, 음, 이건 아니야. 그것이 그녀의 패턴이었다. 남자애가 옷깃을 잡아 끌자 그녀는 그녀는 자신보다 키가 큰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자 고개를 조금 들었다.
" 내 생각엔 그게 더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니. 나도 벌써 소문에 휩쓸려 버린건가. 머릿속이 이상해진 것 같아. 평소의 그녀라면 분개한채로 무언가를 쏘아붙였겠지만 주변 애들 눈치를 보곤 고개를 끄덕였다. 남재애는, 그는, 그녀 자신을 침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 옥상 쪽 계단으로 가자."
옥상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꽤 높이까지 올라야 했기에 옥상 쪽 계단은 그녀가 아는 가장 조용한 곳이었다. 선생님들 피해서 귀걸이 바꿔끼기도 좋은 장소고. -
646 이름 없음 (QHyNBDP6q2) 2020. 8. 2. 오후 10:43:55>>645 여유'롭'인데 오타났넴..
-
647 이름 없음 (xEtlobxqe2) 2020. 8. 2. 오후 10:54:49>>645
" ..... 글쎄. "
아랫입술을 깨물며 답답함을 참고 있던 여학생이 이내 이상한 질문과 함께 얼굴을 붉히자 그는 다시금 눈을 깜빡이더니 두루뭉실한 대답을 꺼낸다. 표정 마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 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여학생의 답답함을 가중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아이들의 오해라던가 소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거라 생각한 듯 눈을 피하기로 마음 먹은 남학생이었다.
" 그래도, 소문이 나쁜 쪽으로 돌아서거나 하진 않을 걸. 아마. "
덤덤한 목소리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여학생의 말에 차분히 대답을 한 그는 여전히 소매를 살며시 잡은 체 교실 뒷문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이 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고 덕분에 그다지 어렵게 빠져나오지는 않을 수 있었다. 교실을 다 나설 즈음 그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여학생을 돌아보지 않은체, 여학생에게만 들리게 중얼거렸다.
" 너라면 사귈지도 모르겠네.. "
고백을 한다면, 이라는 말은 그저 입 속에 삼킨 체로 중얼거린 그는 더이상 입을 열지 않은 체 옥상 쪽 계단으로 걸어갔다.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들을 힐끗거리며 바라보는 아이들을 무시한 체 터벅터벅 걷기 시작한 그는 여전히 여학생의 소매를 살며시 잡고 있었다.
// 그정도 오타는 귀여우니까 괜찮아~ -
648 이름 없음 (QHyNBDP6q2) 2020. 8. 2. 오후 11:34:10>>647
"뭐야 니들"
은근한 눈빛을 하며 소곤거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길을 여는 애들에게 그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던졌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눈 좀 하지 말라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해명하고 싶었지만 들은 거라곤 친구 A의 은근한 언질 뿐이었기에 소문을 더 키울까봐 더 말도 못하고 불만이 가득 느껴지는 태도로 투박하게 걸음을 옮겼다.
" 너는 뭐 이게 남의 일이야?! 심지어.. 심지어!"
그녀는 분에 못찬 목소리로 호기롭게 말을 꺼냈으나 뒷말은 삼키고 묵묵히 복도를 걸었다. 그 뒷말은 아마 '심지어 왜 내가 고백했다는 건데? 네가 고백해서 내가 시원하게 찼다는 얘기면 또 몰라!' 정도였을 것이고, 남자애의 눈치가 빠르다면 대충 짐작할 만한 뻔한 말이었다.
" ...너, 너랑 나랑?"
말을 더듬거리며 당황한 채 계단 위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은 그녀는, 벽에 머리를 쿵 박으며 얼굴을 식혔다. 다시 생각해본 결과 얘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농담이나 하고 있구나. 정도로 결론을 내린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봤다.
" 너랑 내가 어떻게 사겨? 일단 난. 너한테 고백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고, 넌. 넌 원래 그런거 관심 없잖아.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누구한테 소문에 대해 듣거나 최근 이상한 일 없었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뱉어내던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 그냥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남자랑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소문에 휩싸여야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벽에 머리를 콩콩 찧었다. 머리가 잔뜩 눌리는 것도 신경쓰이지 않을 만큼 이 일은 중요했다.
#뭐야 다정해! 감동이야..! -
649 이름 없음 (JXnCy/baG.) 2020. 8. 2. 오후 11:47:12" 남의 일은 아니지. 소문에 나도 껴있다며. "
여학생이 분에 찬 목소리로 하는 말에도 그는 덤덤하게 대꾸를 하며 복도를 걷는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를 태연한 무표정은 씩씩거리는 여학생의 소리에도 그다지 미동은 없었다.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터벅터벅 둘이서 복도를 걸어간다.
" 뭐.. 그렇지. 너랑 나랑. 애초에 여기엔 나랑 너 밖에 없는걸. "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여학생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 그는 이어진 여학생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한걸음 더 다가설 뿐이었다. 머리를 쿵 박던 여학생이 다시 자신을 쏘아보는 모습에도 그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 왜 그런 눈으로 봐? ' 하는 듯한 눈을 해보인다. 반쯤은 여학생의 반응이 재밌어서 일부러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지만.
"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도 너한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그러다 머리에 상처난다? "
벽에 머리를 콩콩 찧는 여학생의 머리와 벽 사이에 자신의 손을 끼워넣어선 더이상 머리를 찧지 못하게 한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그렇게 자신과 사귄다는 소문이 싫은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생각을 하던 소년은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다 천천히 입을 연다.
" 아, 저번에 너가 나한테 짜증나는 일 있었다고 옆반의 OO 이야기 하려고 집에 가려던 걸 학교 뒷편으로 끌고 가던 걸 본 게 아닐까? "
의심할만한 것은 그정도 뿐이라는 듯 생각을 하던 그는 말을 하고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무릎을 굽혀선 여학생과 눈을 마주한다.
" 근데, 그 소문이 그렇게 싫은거야? "
// 여학생 귀엽다~ 감동이라니 별거 아닌걸? 😁 -
650 이름 없음 (F7NnAmwb2I) 2020. 8. 3. 오전 12:21:42>>649
" 그런 건 보기만 해도 아는 거라고. 난 항상 거울을 보면 내가 예쁘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녀는 되도 않는 잘난체를 하며 팔짱을 끼더니 느긋해보이는 남자애의 태도에 한숨을 푹 내쉰다. 그래, 그래. 너한테 열내서 내가 뭘 얻는다고.
" 너..너! 자꾸 이럴거야? 너의 이런 행동이 소문을 더 부추기는 거라고. 앞으론 내가 길가다가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도 관심두지 않기로 해. 대답해! 약속해!"
벽과 자신의 머리 사이로 두툼하고 폭신한 무언가가 들어오자 황급히 자세를 바로한 그녀의 얼굴에 붉은 색이 물들었다. 입을 삐죽내민 그녀는 남자애를 빤히 바라보더니 자기만의 결론을 내렸다. 그래, 얜 이 소문이 싫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날 괴롭히는 걸 좋아하니까!!
" 근데 그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었는걸. 난 항상 수학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낸 얘기라든가, C가 나한테 시비건 얘기나, 체육 수행 시간 때 선생님이 B를 줘서 화가난 얘기 같은 걸 너한테 말하려고.."
그렇다. 그녀는 화가나면 바로바로 풀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 남자애를 찾아갔다. 집에 가고 있으면 휙 끌어다 벤치에 앉혀 이야기를 나눴고, 등교길에도 잠깐 이리 오라며 끌어 당기고, 심지어 밤에 슈퍼가다가 만났을 때에도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속여서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서 신나게 화를 풀곤 했다. 그는 언제나 고민을 잘 들어줬고, 그녀보다는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통해 그녀를 달래 주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때 그가 그렇게 물어오자, 왠지 모르게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동안 얘도 참고생했겠다, 싶은. 그래서 지금 이 태도는 그에 대한 복수다 이거지?
" 당연하지.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오해하고 빼빼로 데이 때 빼뺴로를 안 주거나, 진짜 커플이 될 기회를 놓치거나 하면 네가 책임질거야? 물론 너를 좋아한다고 했던 H를 생각하면... 좀 통쾌하지만!"
H는 그녀 반 여자애로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시콜콜 그녀를 귀찮게 하는 친구였다. 결국 못참고 싸운뒤로 이제는 원수가 된.
#남학생... 훅 들어오는거 설렌다 ㅠㅜㅠㅜ -
651 이름 없음 (J7Rsl2LJ7M) 2020. 8. 3. 오전 12:35:57>>650
" 너? 예쁘긴 하지. 응, 너 예뻐. "
팔짱을 낀 체 말하는 여학생의 말에 태연한 표정으로 당연한 말을 한다는 듯 대꾸했다. 다 아는 걸 굳이 왜 말하냐는 듯 그의 고개는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덤덤해보이는 얼굴에서 어느샌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 그렇게 죽으면 아마 죽어서도 부끄러울테니까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구해준다고 약속할게. "
여학생의 투정이 익숙한 듯 여학생이 재잘거리는 동안 먼곳으로 시선을 돌린 체 듣고 있던 그는 이야기가 끝나자 여학생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청개구리처럼 대답한다. 손은 여전히 여학생이 머리를 찧을까 벽에 붙여두고 있었다. 마치 여학생에게 상처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 듣고 있으면 재밌긴 했지. 열을 내는 네 모습이 다 머리 속에 그려져서. 그래도 나랑 이야기 하는거 재밌잖아? "
여학생의 속을 알면서도 그는 태연하게 이야기의 끝을 살며시 비틀어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오려했다. 투정을 부리는 여학생을 보며 짜증을 낼법도 했지만,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을 바라보는 눈은 따스함만 담겨 있었다. 마치 귀여운 고양이를 보는 것처럼.
" 빼빼로.. 작년에도 내가 줬던 것 같은데 맛 없었어? 올해는 좀 더 신경쓸게. "
어느샌가 완전히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던 남학생은 여학생의 투정을 가볍게 받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더니 이내 아예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춰 앉은 남학생이 좋은 생각이ㅜ있다는 듯 입을 연다.
" 근데 이대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면 너가 날 가지고 놀았다고 애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할지도 모르는데 큰일이네. "
그치? 하고 가볍게 덧붙인 그는 태연하게 웃어보이며 여학생을 수긍시키려는 듯 눈을 마주했다.
"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귀는 걸로 해볼래? "
// 여학생도 귀여운 걸..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졌어
-
652 이름 없음 (F7NnAmwb2I) 2020. 8. 3. 오전 12:51:45>>651
" 맞아."
그녀는 예쁘다는 남자애의 말에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네가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맨날 싸우고 다니는 거란다." 하고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다. 엄마, 이것 봐요. 얘도 내가 이쁘다고 인정하잖아요.
" 응, 그렇겠지."
남자애의 대답에 그녀는 자포자기했다. 말로 이기기 힘든 상대라는 건 옛날에 깨우쳤지.
" 그치? 우린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인거야. 난 화를 풀어서 좋고 너는 재밌잖아. 맨날 재미없게 지내면서."
그가 재미없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나치게 바쁘고 복잡하게 사는 거였다. 적을 안 만들고 사는 건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항상 가십거리를 이끌고 다녔지만 굳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그녀가 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였다. 그저 목소리가 크고 정의롭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낼 뿐. 게다가. H가 얠 좋아하는데 내가 얘랑 어릴 때부터 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 아니. 그건 맛있었어. 근데 우리 빼뺴로 얘기 하고 있었나?"
눈높이를 맞추는 남자애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귀에 다른 건 안들리고 "우리 사귀는 걸로."라는 소리만 박혔다. 네? 저기요.
" 싫어 싫어! 너랑 나랑 사귀는 걸로 해서 뭘 얻는데"
H는 질투할 거고, 애들은 우릴 엄청 신경 쓸 거라고. 나를 좋아하던 옆반의 남자애들, 내 팬클럽(이라고 지칭하지만 대충 그녀를 좋아하는 한 무리의 남자애들을 의미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관심이 얼마나 좋았는데. 절대. 커플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 그치만 안 사귀면 내가 널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이 돌겠지. 분명."
적이 많은 건 자신이니 소문이 돌거든 분명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았다.
#혹시 1:1 상황극 할 생각 있어? 뭔가... 돌리다 보니 여기서 돌리긴 한게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돌리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생각 있으면 쉬는시간 끝! 땡땡땡으로 마무리 짓고 나머진 1:1에서 이으면 될 것 같은데..!
-
653 이름 없음 (vr02TkhS8.) 2020. 8. 3. 오전 1:02:49한결같은 아이. 남학생은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냥 가버렸을지도 모를 여학생의 대답에도 그저 태연하게 미소를 지어보일 뿐이었다. 익숙하기도 했고, 그는 이런 여학생을 받아주는걸 즐기는 편이었다. 내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 반응이 왜 그래? 이럴땐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
물흐르듯 여학생에게 좋은 것을 알려준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 그는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려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여학생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녀와 함께하곤 했던 것이다.
이어진 여학생의 말은 딱히 무어라 대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겨버린다. 가끔은 소녀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었기 때문이지만. 여학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만 알 일이었다.
" 어.. 빼빼로 이야기 하고 있었지. 빼빼로 받고 싶다 그랬으니까. "
멍하니 되묻는 여학생의 말에 정답이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대꾸하는 남학생이었다. 종종 이렇게 자그마한 함정에 빠져드는 여학생을 보는 것이 꽤나 귀여웠기 때문이지만.
" 그러니까 사귀는걸로 하자. 잘 부탁해. 현 애인님 "
여학생이 머리를 찧느라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해주려는 듯 익숙하게 손을 뻗으며 나지막이 말하는 남학생이었다. 그 손길에는 여학생이 아는지 모르지만 진심의 온기가 담겨있었다.
때마침 쉬는 시간의 끝을 알리는 종이 천천히 울려퍼졌다.
// 나도 좀 더 여학생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이어가보고 싶어! 나랑 1대1 해줄래? 😊 -
654 이름 없음 (F7NnAmwb2I) 2020. 8. 3. 오전 1:08:13>>653 영광이지! 1:1로 갱신할게~
-
655 이름 없음 (llSQa.QVKE) 2020. 8. 5. 오후 7:30:33먼바다 작은 섬에는 낡은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궂어 배가 다니지 않는 날이면 기다란 등대 그늘 아래에는 낚싯대가 하나 드리워져있고는 합니다. 방파제 위에 앉아 낚싯대를 잡은 소년이 이따금씩 능숙하게 챔질을 합니다. 밀짚모자를 쓴 소년은 고기보다는 엄한 것을 낚을 때가 더 많지만 무언가(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늘이 불그죽죽하게 물들었을 때, 무언가가 낚여서였는지 누군가가 불러서였는지 소년이 반색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막 사춘기가 왔을까 앳된 얼굴이 발그레합니다.
//처음이라서 짧게 써봤어.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이어줬으면 하지만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소년과 가족 관계인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어! -
656 이름 없음 (dO7.z2EwpQ) 2020. 8. 5. 오후 8:59:44>>655
소녀는 작고 어리고, 조용했다. 소녀는 예쁘게 접은 종이비행기 하나를 들고, 백옥 같은 피부색을 붉은 노을에 물들여 빛내며 나무로 만든 딱딱한 신을 신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잔잔한 파도만큼이나 잔잔하게 흔들리는 얇은 원피스가 마치 소녀를 감싸 함께 날릴 것만 같다. 작은 발을 내딛어 발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걸어온 소녀는 조심스레 비행기를 날렸다. 연노란 색종이가 그 순간만큼은 비행기가 되어 톡, 하고 물 위로 떨어지더니 이내 둥둥 떠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소년이 얼굴이 소녀의 눈동자에 가득 찬다.
" 안녕?"
그리고 소녀는 두 다리를 예쁘게 모아 소년의 옆에 자리잡고 앉는다. 방파제 사이로 들어온 물과, 미끄러운 이끼에 시선을 둔 소녀가 다시 소년의 얼굴로 시선을 옮겨 검은 두 눈을 빤히 맞춘다.
" 여긴 위험해."
#괜찮게 이었을지 모르겠다! 분위기가 오묘하고 예뻐서 한 번 이어봤어. -
657 이름 없음 (gqL5vicNQc) 2020. 8. 6. 오전 1:05:20갱신~
-
658 이름 없음 (Y4u8/KPx0Y) 2020. 8. 6. 오전 1:07:58>>656
소년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대신하곤 바위틈에 끼워둔 낚싯대를 들어 올립니다. 느슨하게 풀어진 낚싯줄이 파도에 실려 멀어지는 색종이를 느리게 따라갑니다. 놀빛에 물든 투명한 실이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허공에서 부드럽게 호를 그립니다.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것에는 달리할 말이 없습니다. 발밑의 미끄러운 이끼와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바람에 깎여 거칠어진 방파제의 표면이 몸을 편안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붙이고 있을 때의 포근함은 그런 걱정마저 무뎌지게 합니다. 소년은 낚싯대를 갈무리한 뒤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구부정한 몸을 바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가까이 앉은 소녀와 눈을 맞춥니다. 노을이 비친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붉게 반짝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소년의 두 뺨도 따라서 발개집니다.
"노을이 예뻐."
변성기가 아직인 소년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여립니다. 소녀의 눈동자에 비친 노을이 예쁘다는 말이었을까, 노을빛에 물든 소녀의 눈동자가 예쁘다는 말이었을까. 당장이라도 동공이 풀어질 듯 위태하게 눈을 맞추고 있던 소년은 금세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바다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 눅진한 여름 공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소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녀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낚싯대를 잡고 있던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 오묘하고 예쁜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싶네. 아직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도 애매해서 조심스럽게 이어봤어. 혹시 잇기 어렵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그리고 잘 자 참치야:3 -
659 이름 없음 (Y4u8/KPx0Y) 2020. 8. 6. 오전 1:19:06//>>658에 조금 덧붙이자면, 뜬금없이 "노을이 예뻐."라고 한 건 "여긴 위험해."에 대한 말 돌리기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중간에 설명을 끼워 넣었어야 했는데 난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
660 이름 없음 (gqL5vicNQc) 2020. 8. 6. 오전 2:11:26>>658
소녀는 멍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그 몸마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방파제와 같이 딱딱해져서 소년이 낚시줄을 거두어들이는 걸 지켜본다. 불어오는 바람에 소녀는 몸을 조금 움츠리면서도 전혀 이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소년의 발간 두 뺨을 눈치챘는지 아닌지, 소녀는 잔잔했다. 노을이 예쁘다는 그 말에는 약간 입술을 빼죽였지만.
" 이곳에 온 걸 알면 난 분명 엄마한테 혼날거야."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녀는 싱긋 웃어보인다. 소녀의 목소리는 매우 얇고 투명했다.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도 그 목소리를 훔쳐갈 것만 같았다. 인어공주의 목소리처럼 앗아가기 쉬운 목소리였다. 단정하게 내렸던 앞머리는 바람에 위로 동동 날렸고, 소녀는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오히려 눈을 감고 고개를 살며시 저어 주변 잔머리마저 얼굴에서 떨어져 깔끔하게 바람의 방향을 따르도록 두었다.
" 뭘 좀 낚았어?"
상냥한 목소리로 소녀는 그렇게 물었다. 긴 머리칼을 모두 뒤로 날아가게 두고, 가려진 것 없이 동그랗고 맑은 그 얼굴로 소녀는 소년을 다시 곧게 응시했다.
#아냐 전혀 난해하지 않았어! 친절해라. 음음 자유상황극이니 이렇게 방향없이 돌리는 묘미가 또 있는 거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새드엔딩이나 슬픈 분위기를 좋아하긴 해! 참치 취향이 아니라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어줘~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 안 잤네, 그래도 좋은 밤 보내라는 의미로 알아들을게. 너참치도 좋은 밤!
-
661 이름 없음 (nozEigYoxg) 2020. 8. 7. 오전 1:23:42>>660
소년의 감정은 해변의 파랑 같아서 한껏 밀려왔다가 금세 쓸려나가곤 합니다. 혼이 날 거라는 소녀의 말에, 소년은 괜한 꾸중을 들은 것처럼 보로통하게 입을 닫았습니다. 비죽 나온 입술이 자꾸만 우므러져 금방이라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웃음이 예뻐서 더 그랬습니다. 그 웃음은 항상 이번이 마지막인 것만 같아서, 더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랬습니다.
소년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썼습니다. 소녀와 같이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자꾸만 울적해져서, 표정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소녀의 물음에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소년은 한참이나 지나서야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쏨뱅이랑 도미."
소년은 그렇게 말했지만 물에 잠긴 어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고기도 하나의 생명이라서, 살려준 만큼 생명으로 보답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놓아줄 때마다 어떤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이거는 소녀에게는 비밀입니다. 소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망이 열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 웃기지 않아?"
소년은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으면서, 노을에 눈이 시다고 손등으로 눈을 덮었습니다. 웃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즐거우니까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웃었습니다. 소년은 웃는 것을 멈추고 나서도 눈을 가린 손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아직 시어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답레가 많이 늦었지. 혹시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 미안해. 일찍 가져오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일이 많았어:(
그리고 나도 새드엔딩이나 슬픈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 참치야, 오늘도 좋은 밤:3 -
662 이름 없음 (KRRZfxYnl6) 2020. 8. 7. 오전 10:19:52>>661인데, 새벽에 무슨 급발진을 한 거지 ㅠㅠ. 마지막 문단은 못 본 걸로 해줘도 괜찮아...!
-
663 이름 없음 (ztTyAKL.bs) 2020. 8. 7. 오후 1:53:56>>660이야! 아냐 읽으면서 별 생각 없었는걸? 오히려 좋았어! 마지막 문단도 본 걸로 할거지롱!
사실 어제 새벽에야 읽었는데 너무 졸려서 못 잇고 자버렸다..ㅠ 오늘 중으로 시간 내서 답레 써올게! -
664 이름 없음 (ztTyAKL.bs) 2020. 8. 7. 오후 10:57:57>>661
표정이 안 좋은 소년을 바라보며 소녀는 조용하고 다정하게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자를 푹 눌러썼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방파제를 조심히 건너, 더욱 가까이 다가서 앉아 눈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미소는 그대로 유지한채로. 소년이 고개를 들자 소녀의 얼굴은 더욱 밝아진다. 뉘엿뉘엿 지는 해의 빛이 소녀의 얼굴위로 빛난다.
" 쏨뱅이랑 도미?"
소년의 말을 다정하게 따라하는 소녀의 얼굴에 장난기가 어렸다. 소녀는 갸냘픈 몸짓으로, 밝게 양손의 검지를 들어 삐죽삐죽 찔러보인다. 비늘이 삐죽한 애들이네? 라고 덧붙이면서.
소년이 물고기가 다 도망가버렸다면서 눈을 덮고 한참 웃는 모습을 소녀는 조금 놀란듯 바라보았다. 꽤 놀랐던 모양인지 조금 굳어 있던 소녀는 계속해서 눈을 가리고 있던 소년의 손 위를 가볍게 덮어 보려고 했다. 그냥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보고 싶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말이다. 하지만 또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서 굳었던 표정을 풀며 태연하게 물었다.
" 오늘 잡은 애들은 어떻게 생겼었어? 빨갰어? 작았어? 말랐어?"
소녀의 하얀 원피스가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소년의 몸에 닿았다 떨어지길 반복한다. -
665 이름 없음 (CaG7Cejwh.) 2020. 8. 7. 오후 11:23:13아하하, 그렇지 뭐.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같은 과 아이들의 원성을 들으며 술자리에서 뛰어나온다. 가게 밖을 나서자 반겨오는 후덥지근한 여름 바람이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방금 전의 답답한 분위기보다는 시원하다.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긁적인다. 흡연자도 아니니까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발 끝만 내려다본다.) 히어로가 무슨 대수라고. 영원히 먹여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유명세를 타게 된 히어로 "플라티나", 그게 본인임을 어쩌다 들킬 뻔한 상황을 친형이라고 둘러대버렸다. 조용히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글러버린 것 같다. 낮게 한숨을 내쉰다.)
#정체를 알고 온 같은 히어로나 빌런, 혹은 정체를 몰라도 괜찮아! -
666 이름 없음 (HerHEGulMY) 2020. 8. 8. 오후 6:59:43>>665 (오랜만에 친구와 자주 가던 술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다. 요즘 입소문을 타서 대학 회식자리로 핫해진 터라, 괜히 걸음이 빨라진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딛치고 싶지 않아 걸음만 서두르며 술집 앞으로 나와보니 웬 남자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지 뭔가. 아,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웬 길막이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히어로 어쩌고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도 좋게 말하자. 빨리 들어가서 자리도 잡고 에어컨 바람 쐬고 싶으니까. 가뜩이나 불쾌지수 높은 날인만큼 단골집이라 해서 위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헛기침 소리로 기척을 낸 뒤,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저기, 들어가게 좀 비켜주시겠어요? -
667 이름 없음 (6VxQjEUIuo) 2020. 8. 9. 오전 12:38:21>>666
(헛기침 소리에도 다른 생각에 매진이던 차에, 갑작스레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덩치에 걸맞지 않게 화들짝 어깨를 띄우면서까지 놀랐다. 거기까지면 좋겠지만, 마침 꺼내려던 휴대폰까지 떨어뜨려버렸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과, 당신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겹쳐 허둥지둥한다.) 아, 죄송,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네. (액정부터 떨어져있는 모습을 흘끗흘끗 확인하면서 당신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보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렇게 되뇌이며.) -
668 이름 없음 (hk6zjTpRbs) 2020. 8. 9. 오전 3:50:01>>667 (아이쿠, 깜짝이야. 내가 더 놀랬다. 이 정도 소리에 놀랄 거면 가게 앞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입구용 매트 위니까 괜찮으려나. 아냐, 액정부터 떨어져 있으면 가능성은 희박하고, 괜히 내가 손 대서 망가졌다는 식으로 시비걸릴 수 있으니까 주우면 지나가자. ...안 줍잖아. ) ..... (고민하다가 떨어진 휴대폰을 요리조리 피해서 발을 딛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 마침 구석자리에서 일행이 일어나고 있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가 비자마자 가방부터 놓고 자리에 앉았다. 생수 한 잔을 따라 마신 뒤, 핸드폰을 집어들고 친구에게 자리 잡아놨다고 톡을 보냈다.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중이라는 걸 보면 금방 올 것 같다. 올 때까지 오늘은 뭐 먹을 지 정해놓을 심산으로 메뉴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
669 이름 없음 (RxOO9eBRAk) 2020. 8. 12. 오후 11:18:09갱신~
-
670 이름 없음 (8ROtF/aKA2) 2020. 8. 13. 오전 12:40:35"실례"
화장이 짙은 얼굴과 다르게 은은한 미소로 한 여성이 당신의 뒤에서 나타난다. 문 앞에서부터 유난히 시끄럽고 거친 대화가 가득한 술집 안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그녀는 당신을 조심스레 피하더니 바텐더의 바로 앞에 앉아 하얀 손가락으로 턱을 괴었다. 까만 단발과 대조되는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옅은 조명에도 빛나는 피부가 주변의 시선을 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얇은 가디건을 옆 의자에 걸친 다음 당신을 은근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왼쪽 귀의 링 피어싱을 만지작거리며 주문을 한다.
"발렌타인 17년산, 온더락 잔에."
그녀는 장난기 있게 웃더니 시선을 당신에게 고정했다. 시끌벅적한 소리에 금방 그 웃음소리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낮고 투명한 음색이 당신의 귓가에 계속 맴도는 듯하다. 바텐더와 오래 알던 사이인지 간단한 손짓으로 안부를 나눈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글라스를 잡아, 맨들거리는 표면을 따라 흐르며 형형색색으로 빛나던 물방울이 무릎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높은 의자에 얹어진 듯 가벼운 자태로 앉아 있던 그녀는 당신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는 듯 참을성 있게 칵테일을 목으로 넘겼다. 보라색 조명이 그녀의 맨 다리에 스타킹을 신기듯 싸고 돈다.
"라이터가.."
그녀는 기다랗고 얇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더니 깨끗한 화이트 색상의 클러치를 뒤지다가 미간을 찌푸린다.
#뭔가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가 끌려서 써봤어. 두 남녀의 위험한 사랑으로 스토리가 흘려도 좋고, 마피아의 은거지에 있는 술집 느낌도 좋고! -
671 이름 없음 (VGpLeAXonA) 2020. 8. 13. 오전 12:54:52>>670
" 불, 필요한 것 같은데 "
자그마한 잔에 담긴 술로 입술을 적시며 떠들썩한 바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남자는 차분하게 흘러내린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다. 깊은 어둠처럼 내려앉은 검은색 눈동자는 그저 술이 담긴 잔에 향한 체 움직일 줄 몰랐고, 그 분위기는 그 누구도 말을 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득 어느샌가 자신을 향한 은은한 시선이 느껴지자 천천히 시선을 돌린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다. 왠지 귀에 스며드는 목소리에 이끌리듯 바라본 남자는 이내 라이터가 없는 듯 가방을 뒤적이는 여자에게 다가가 듀퐁 라이터를 품에서 꺼내 불을 켜서 내밀었다.
" 얼굴에 뭐라도 묻었으면 말을 하지 그래,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있으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데. "
남자는 차분한 듯 하면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여자에게만 들리게 말했고, 할 말이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마시던 잔을 들어 다시금 입술을 적신다. 쌉싸름한 보드카의 향이 입안을 맴도는 것을 느끼며 남자는 시선을 여자에게로 향했다.
" 날 죽이러 왔을리는 없을텐데. 값비싼 것들을 가진 녀석들은 저 안에나 있을테니. " -
672 이름 없음 (8ROtF/aKA2) 2020. 8. 13. 오전 1:12:03>>671
"고마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결국 남성의 입을 여는데 성공한 그녀가 입에 담배를 물고 다가가 불에 끄트머리를 대고 빨아들인다. 불빛이 깊이 타오르고 나서도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던 그녀는, 성공했다는 듯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도톰한 입술에 있던 글로시한 루즈가 하얀 담배에 그대로 남는다. 그녀는 청회색 눈동자로 그를 노골적으로 훑는다.
"너무 부정적이다~ 그쪽이 마음에 들었다곤 생각 못하는 거야? 좀 더 자신감을 가지라구."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애교 섞인 목소리는 꽤 차가워보이던 겉모습과는 달랐다. 다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투명해서 어딘가 위압적이고 또 차가운 분위기를 풍긴다.
"안주도 없이 썡 술만 마셔?"
그녀는 이번에도 가벼운 손짓으로 바텐더를 부르더니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인다. 아까 라이터에서 불을 가져갈 때에도 그렇고 몸짓 하나하나에 야릇함이 묻어난다. 바텐더는 그녀만을 위한 것인지 메론, 사과, 오렌지 등의 과일이 화려하게 플레이팅 된 접시를 건네고,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에 생크림을 담아 건넸다. 접시에 놓인 두개의 포크를 바라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인 그녀는 지폐 한 장을 바텐더의 셔츠 주머니에 꽂고, 포크에 사과를 하나 찔러 당신에게 건냈다. -
673 이름 없음 (uhdPK.HssE) 2020. 8. 13. 오전 1:31:16>>672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훑어보는 여자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묵묵히 입안에 머금었던 술을 음미하듯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옆에서 들려오는 애교 섞인 목소리에 오습다는 듯 작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어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의 말이 기분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알기 힘든 웃음이었지만 그것을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서서히 남자의 입술이 열렸다.
" 그럼 나도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불을 빌려줬다고 해두면 되겠군. 의외로 내가 불을 붙여주는 경우는 드물거든. "
남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농담을 하듯 여자의 말에 대꾸한다. 여자의 목소리에서 은은하게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애시당초 그는 그런 것 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이 자신감이 아닌, 잃을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자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누구처럼 화려한 건 잘 안 어울려서. 뭐, 오랜만에 안주가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야. "
어깨를 으쓱여보이며 대꾸한 남자는 이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여 말하고는 무엇이 재밌는지 낮은 웃음소리를 낸다. 그러다 종업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자, 화려한 플레이팅이 올라감 접시가 나오는 모습에 그저 흥미가 없는 듯 잔에 담긴 술을 빙빙 돌릴 뿐이었다. 여자가 포크로 사과를 집어 건내자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자는 잔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저어보이곤 이내 사과를 내민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한다.
" 나한테 내줄 시간이 있나? 왠지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같은데. "
쓸데없는 행동들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듯, 빙빙 돌려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여자와 눈을 마주한 체 덤덤히 말한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여자의 청회색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보고 싶은 것처럼. -
674 이름 없음 (pZQNuLNHsk) 2020. 8. 16. 오후 11:28:56배고파…배고파…배고파……. (어찌들으면 구울이나 좀비류의 몬스터로 생각될 만큼의 탁한 목소리. 전멸한 파티 내에서 혼자만 벽에 기대어 중얼거리고 있다. 파티들은 얼마 안있어 마을에서 부활할 테지만, 던전 진행도를 생각해보면 돌아가기에도 아깝다. 그렇다고 움직일 힘도 없어, 몬스터라도 가까이 오면 휘두를 생각으로 검을 쥔 손에 힘을 준다. 수척한 얼굴을 푹 숙인 채, 멀리서 들려오는 기척을 느끼곤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
-
675 이름 없음 (yuBU15eq3c) 2020. 8. 16. 오후 11:31:58>>674
... 살아있는 사람이었나. ( 천천히 걸음소리를 내며 걸어오던 판금 갑옷을 입은 인영이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당신을 보며 중얼거린다. ) 아니면 언데드? 몰골을 보니 언데드 같기도 하고. ( 금방이라도 뽑아들 것처럼 철컥이는 검의 소리와 밝게 빛나는 횃볼을 좀 더 가까이 해서 비춰보며 말한다. ) -
676 이름 없음 (pZQNuLNHsk) 2020. 8. 16. 오후 11:34:30>>675
(환각? 환청? 정신계 공격을 받았나? 보통은 마법 아이템으로 그 유무를 가리곤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남은 아이템이라곤 오직 숏소드 한자루 뿐이다. 죽음에 대항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밖에. 상대가 충분히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당신이 횃불을 얼굴 쪽으로 가져다댄 순간, 남아있는 체력을 전부 소모해 목을 향해 검을 휘두른다. 몸의 무게가 과도하게 실려 앞으로 철퍼덕 넘어질 정도로.) -
677 이름 없음 (Dbg9fcAuPQ) 2020. 8. 16. 오후 11:37:48>>676
이래서 장비에 돈을 들이는데 아낄 필요가 없지. ( 깡 하는 소리가 고요한 던전 안에 울려퍼지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판금갑옷은 잘 손질된 듯 보였고, 그 위에 당신이 휘두른 검이 낸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안쪽까지 닿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 일단 인간인 건 확인했고, 죽여주는게 좋은가 아니면 살려주는게 좋은가. 둘 중 하나 선택하도록. 시간을 오래 지체하고 싶진 않으니. ( 덤덤하게 철퍼덕 넘어진 당신을 내려다보며 검의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 -
678 이름 없음 (pZQNuLNHsk) 2020. 8. 16. 오후 11:45:28>>677
(앞으로 엎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실로 그 충격만으로 죽었을 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꾸준히 한 마디만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배고파……. 배고파. (눈 앞에 서있는 건 인간인가? 어중간한 실력으로 솔로잉으로 내려올 만한 곳은 아닌데, 다른 파티의 정찰원이라기엔 장비가 쓸데없이 좋다. 흘끔 올려다본다.) 마법사 시체에, 정령시계…갖고 있어. 몇 마리, 몇 화력이야? (정령으로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아이템은 귀한 편이니까 정보를 흘린다.) -
679 이름 없음 (Dbg9fcAuPQ) 2020. 8. 16. 오후 11:48:44>>678
(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판금갑옷은 검의 손잡이에서 손을 내려놓더니 등에 매고 있던 배낭을 뒤적거리기 시작한다. ) 좋은 정보군, 참고하지. ( 덤덤하게 대꾸한 판금갑옷은 엎어진 당신의 손 끝에 부드러운 빵덩어리 하나와 포션 하나를 내려둔다. ) 솔로다. 파티 같은 건 없다. 정보도 미상, 넌 알고 있나? ( 마법사의 시체로 걸어간 갑옷은 뒤적거려 정령시계를 손에 넣고는 태연하게 대꾸한다. 귀찮은 걸 묻는다는 것처럼. ) 그 빵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그 후에 돌아가던 같이 앞으로 나아가던 마음대로 해라. -
680 이름 없음 (pZQNuLNHsk) 2020. 8. 16. 오후 11:55:28>>679
(자신의 앞에 놓여진 빵과 포션을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주워먹는다. 던전에서 제일 기분 나쁜 죽음은 항상 아사였으니까. 포션은 유리까지 깨먹을 기세로 삼키고는 먹는 동안 참고있던 숨을 길게 내뱉는다.) 제길, 정보값 치고는 너무 싼 거 아니냐…….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한달 간의 탐사 스케줄은 모두 외우고 왔어. 거기에 솔로잉은 없었다고. (먹고 기운을 차렸는지, 후드 속 눈동자가 제법 흉흉하게 빛난다. 손에 들린 남은 빵을 흔들거린다.) 잠깐, 왜 우리가 전멸했는지 안 궁금해? 어지간히 자신있나보네. -
681 이름 없음 (qAQdk0MMCU) 2020. 8. 16. 오후 11:59:35>>680
탐사 스케쥴.. 귀찮은 것들은 생략한다. 혼자서 움직이면 그런건 편하니까. 모르는 것도 당연하겠지. 스케쥴에 올릴 생각을 안 하면 알 턱이 없으니. (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당신이 귀찮은 걸 묻는다는 듯 태연하게 답한 갑옷은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곤 허리에 달아둔 주머니에 넣는다. ) 뚫지못하면 죽는다. 죽으면 다시 도전한다. 그것 뿐이다.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그게 강해지는 방법 아닌가? ( 당연한 걸 묻지 말라는 듯 어깨를 으쓱인 갑옷은 슬슬 기운을 차렸다고 생각한 것인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 나는 갈거다, 넌 .. 알아서해라. -
682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2:07:36>>681
아아, 중앙관리국 직원들이 입이 닳도록 욕하던게 네 이야기였구나. 절차를 귀찮아하는건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더 귀찮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적어두는거라고. (에휴, 작게 한숨을 쉬고는 동료들의 시체들을 둘러본다. 그리곤 사제의 약초주머니에서 제령가루를 꺼내 모두의 시체에 뿌려둔다. 최소한이지만 좀비가 되는 일은 없겠지.) 와, 듣기만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한 실력자라는 점은 알겠지만 말야, 아는 게 곧 힘이라고? (에구구, 신음을 흘리며 일어서서 먼지를 툭툭 턴다.) 앞에 있는 것의 정보를 주지. 보상도 전부. 대신, 책 한 권만 챙겨가겠어. -
683 이름 없음 (BThAqda28I) 2020. 8. 17. 오전 12:14:56>>682
녀석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는 자주 들었다. 근데 귀찮아서 금방 관심이 식어버렸지.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나? ( 한숨을 내쉬는 당신의 반응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태연하게 답할 뿐이었다. 그들의 투덜거림은 갑옷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듯 했다. ) 부딫치면 배운다. 배우면 곧 아는 것. 그거면 아는게 힘이지 않은가? 똑같은 생각이었군. ( 당신의 말을 말짱도루묵으로 만드는 논리를 내세워 대꾸한 갑옷은 태연하게 걸음을 멈춰 당신을 돌아본다. ) 책 말인가. 그런 건 가져라. 난 필요 없으니. 그거면 됐나? 출발하지. 1분1초가 아깝다. 선봉은 네가 서도록. ( 앞장 서서 걸어가라는 듯 태연하게 손을 뻗는다. 횃불도 줄 생각인지 뻗은 손에는 횃불이 들려있었다. ) -
684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2:21:39>>683
이야, 갑옷에 잔소리 방지 인챈트로 발라놨나봐. 정말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당신의 성격은 대강 파악했다는 듯이 말을 더 하진 않고는 일어서서 절뚝절뚝 걸어간다.) 한걸음 거리를 백걸음 거리로 돌아가는 게 문제긴 하지만 말야. 너한테 문제가 되진 않겠지… 그래도 다음부턴 꼭 스케쥴은 적어둬. 오해한 다른 파티에게 공격당한다. 서로 손해라고. (횃불을 탁 받아들고는 예이예이, 건성 대답하며 앞장 서서 걷는다.) 좋아. 적은 오크 드루이드야. 수속성과 목속성 마법을 다루고, 흑마법도 다룰 줄 알아서 상대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나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미끈미끈한 장어 젤리였어. 만나본 적 있어? 진짜 끔찍해. 거기 함정. (말하면서 한 타일을 폴짝 뛰어넘는다.) -
685 이름 없음 (OK78hgrGj.) 2020. 8. 17. 오전 12:26:50>>684
...안 그래도 널 만나기 전에 3인 파티를 만났다.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도록 하지. ( 앞장 서서 걷기 시작하는 당신을 따라 걸으며 갑옷이 태연하게 말한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음이 확실해보였다. ) 아, 뭔지 안다. 귀찮은 녀석이더군. 근데 무서운게 딱히 없어서 그런가 변신을 못하더군. 그래서 불마법 스크롤을 사온 걸로 태워버렸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상대는 할 법 하더군. ( 갑옷은 기억이 난다는 듯 말하다 당신이 폴짝 넘은 타일을 별다른 생각이 없는 듯 밟아버린다. ) ...흠 ( 함정을 밟은 갑옷은 태연하게 짧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무언가 커다란게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 뛰어야 할 것 같군. -
686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2:33:19>>685
……불쌍한 굿맨 파티. 좋은 사람들인데 다들 좀 심약한 구석이 있어서. (기억을 뒤져보고는 나지막한 한숨을 내쉰다.) 저항마법도 아니고 두려워하는게 없다니, 정신력이 아득히 높은건가. 근데 한 마리가 아니야. 이 근처에 드루이드 기지가 있어. 로드도 마찬가지지. 그녀석이 갖고있는 책이 필요해. (어이없단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다 곧 경악으로 바뀌어간다.) ─이 바보자식아! 한걸음 거리를 만걸음으로 늘려버렸잖아! (은근슬쩍 은인에게 욕을 하고 절뚝절뚝 달리기 시작한다. 속도도 느릴 뿐더러, 이 근처는 함정 지역이다. 어긋난 뼈에서 나는 고통을 참으며 떨리는 눈으로 앞길을 바라본다.) …가다가 왼쪽 지하로 뛰어들어. 그리고 방울뱀모양 동상의 혀를 뽑아. 기억해, 방울뱀이야!! 방울뱀!!! (라며, 본인은 앞으로 달려간다.) -
687 이름 없음 (L1oERjumIM) 2020. 8. 17. 오전 12:39:33>>686
그렇군. 처음 알았다. 로드를 처리하면 되는거군. ( 책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다. 게다가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신경써야할 것 같은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는 법이다. (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달리기 시작하는 당신을 따라 뛰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말한 갑옷은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잘 따라 뛴다. ) .. 알았다. ( 갑옷은 당신이 시키는대로 달려가다 왼쪽 지하로 뛰어든다. 철과 돌바닥이 부딫치는 소리가 울려퍼지며 잠시 구른 갑옷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다. ) ... 방울뱀. 아닌가, 독사였나. ( 갑옷은 그새 헷갈린 모양인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동상을 둘러본다. 나름 고민을 하듯 둘러보던 갑옷은 방울뱀 말고 다른 뱀 동상은 없었기에 다행히도 시킨대로 방울뱀의 혀를 잡아당겼다) -
688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2:46:14>>687
(아마 함정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만큼, 대가 역시 단순할 것이다. 머리 위에서 방울뱀이 마구 떨어진다거나, 커다란 방울뱀이 튀어나온다거나. 그 정도도 극복못할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거긴 맡기고, 철컥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아마 제대로 방울뱀의 혀를 잡아당긴 것 같았다. 뛰어가던 도중, 자신은 오른쪽 구석으로 뛰어들었다. 방어구가 없으니 낙법으로 간신히 충격을 줄이고, 뱀으로 이루어진 지팡이를 든 석상의 눈을 칼로 찌른다. 쿠궁, 하는 작은 울림과 함께 당신이 있는 방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올라가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압사당할뻔 한걸 구해줘서 고맙다고? 천만에. (벽에 기대서 폼이나 잡고 있지만 다리가 후들거린다.) -
689 이름 없음 (3c8Q8WqeTU) 2020. 8. 17. 오전 12:49:53>>688
감사의 말은 필요없다. 넣어두도록. (당신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벽에 기대 폼을 잡고 있는 당신에게 덤덤하게 말하곤, 고블린들 시체 사이에 서서 은색 검에 묻은 피를 휘둘러 털어내는 갑옷이 있었다. 혀를 잡아당기자 고블린들 한무리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 앞으로는 함정을 조심하도록. ( 마치 당신이 함정을 밟은 것처럼 말한 갑옷은 태연하게 터벅터벅 다가와선 계속 해서 길안내를 하라는 듯 검을 집어넣으머 팔짱을 낀다. ) -
690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2:57:20>>689
하하, 너가 왜 솔로잉을 하는 지 알 거 같아.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자세를 풀고 벽에 손을 대고서 숨을 고른다. 힘들어 죽겠네. 게다가 정규 루트도 아닌 만큼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그래, 누구씨가 함정을 밟은 탓에 방향이 틀려졌어. 초급 모험가들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이곳은 내게 풀밭을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만? (숏소드를 뽑아 바닥에 그림을 그려넣는다. 이 방의 구조, 그리고 이 주변의 모습까지.) 편법을 좀 쓸거야. 오크 무리가 하층으로 내려가는걸 봤거든. 예상컨데 이 함정들 중 하나를 발동시키면 정확히 그놈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어. 장점은 기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단점은 적진 한가운데라는거지. (이해했냐는 듯이 바라본다.) -
691 이름 없음 (Rg8b6SDjpE) 2020. 8. 17. 오전 1:03:28>>690
...음 (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모를 소리를 내며 작게 고개릉 끄덕이는 갑옷이었다. 물론 얼굴은 안 보이고 투구 속의 어둠만 보였기에 진짜 알아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지만. ) 그래서 언제 움직이는거지. 오크 정도라면 문제 없다.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 오크라면 그다지 문제가 아니라는 듯 집어넣었던 은빛장검을 뽑아들며 태연하게 말한다. ) 바로 이동하지. 작동시켜라. 준비는 끝이다. ( 단점을 이해한걸지, 아니면 그냥 넘긴걸지 알 수 없어보이는 갑옷은 언제든 검을 휘두를 자세를 취하며 당신을 바라본다.) -
692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16:45>>691
그래,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아. 나도 오크야 어느정도 버텨낼 수는 있지. (방 안의 석상들 중, 개의 모습을 한 석상의 꼬리를 붙잡고 레버를 내리듯, 아래로 꺾어내렸다.) 근데 한가지 말해주지 않은게 있어. 드루이드 로드는 졸개들하고는 좀 달라. 너의 내면에서 진정한 공포를 끌어올릴지도 모르지. 이 목걸이를 잘 기억해놔. 환각에 걸리더라도 날 공격하는 일은 없길 바래. …간다. (이쪽은 무지 긴장된다고. 한숨을 내쉬며 꺾여내렸던 꼬리를 다시 들어올리자, 바닥이 푹 꺼진다. 떨어지는 아래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오크들이 놀란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 중 한 마리의 목을 빠르게 비틀어 베고, 그림자 속에 숨어들어갔다. 전사를 믿고 게릴라전을 하는 수밖에.) -
693 이름 없음 (v0hmjfT5Kw) 2020. 8. 17. 오전 1:31:28>>692
# 잘 시간이 되서 아침에 이어둘게! -
694 이름 없음 (4Nnsx06MaY) 2020. 8. 17. 오전 1:34:36# 잘자~!
-
695 이름 없음 (hQUkEoAF16) 2020. 8. 17. 오후 2:59:02>>692
흠. ( 갑옷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떨어지면서 무언가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건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없이 눈에 들어온 오크들을 베어내기 시작한다. 당신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듯 거침없이 베어가는 갑옷은 자비란 없어보였다. ) ... 꽤나 많군. ( 하나 둘 갑옷에 부딫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병기들이 늘어가자 중얼거리듯 말한 갑옷은 허리춤의 주머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찢어버리자 커다란 화염구 하나가 날아가 오크 3마리를 불태워버린다. ) 이번 건 그리 성능이 좋지 못하군. ..그나저나 로드는 어디있는가. ( 오크들이 더욱 둘러싸고 있었지만 관심 밖이라는 듯 몸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고는 검을 휘둘러 베어내며 길을 만들기 시작한다. ) -
696 이름 없음 (wF9EszYPnI) 2020. 8. 20. 오전 2:20:38아서는 달이 비치는 강물 위로 조심스럽게 이어진 다리 위를 내달렸다. 이 밤이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서의 걸음에 맞춰 걸리적대는 가죽 가방만이 천 쓸리는 소리를 내며 밤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아서 프랭크, 위대하신 프랭크 가문의 장자로 장차 가문을 잇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면 꿈에 바라던 세계여행은 영영 새장속에 갇힌 새처럼 꿈만 같은 일이 되고 만다. 아직 20살, 이대로 꿈을 버리기에는 젊었다. 아서는 새벽의 선착장에 몰래 숨어들어 화물을 싣는 탐험선에 올라탔다. 짐이 끝없이 실려들어오는 배 안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감시에 걸리지 않도록 한 아서는 배의 창고 안에서 이윽고 출발하는 때를 기다렸다. 배가 기우뚱 흔들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창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바다가 일렁이는 모습이 들어왔다. 푸른 눈동자에 바다가 담겨 아서의 마음처럼 일렁였다. 그러던 순간 창고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온다. 아서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놀란 고양이처럼 눈을 둥글게 떴다.
-
697 이름 없음 (nYt9t0h9M2) 2020. 8. 20. 오전 10:27:29>>696
창고 문 밖에서 나무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와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다 작아지다를 반복하더니 예고없이 창고 문을 열어젖힌다. 등잔을 들고 있는 누군가는 무단승선객 아서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서 뒤로 두 세 걸음 물러났다. 유달리 밝아보이는 등잔 뒤로 플린트락 피스톨의 공이를 짤깍 젖히는 서늘한 소리가 들렸다. 등잔을 든 사람은 아서에게로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거 뭐야, 누구야? 너 우리 선원 아니잖아!"
젊은 여성의 목소리다. 실루엣만 보면 키가 큰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정도 낮게 깔린 목소리도 그렇고, 어딘가 은근히 사람을 짓누르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등잔 옆으로 잿빛 총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불을 뿜기만을 기다리는 전열함의 함포처럼. 아, 총을 들고 있어서 위압감이 느껴지는 걸까?
누군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서의 해명을 기다리는 것이리라. 아서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그녀로선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
698 이름 없음 (ZyowUlKRzk) 2020. 8. 20. 오후 4:37:29>>697
피스톨의 둔탁한 장전음이 선명했다. 아서는 본능적으로 양 팔을 어깨 위로 들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맹수를 피하듯이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인간의 적이 비단 맹수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총을 든 사람은 맹수나 다름 없었다. 그런 당연한 사실은 갓 20살배기인 아서도 알 수 있었다. 눈 앞의 여성은 오랜 시간을 겪어온 선원이라 할 수 있을법하게끔 바다 선원 특유의 거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고급진 저택에서 강아지 처럼 소중하게만 길러진 아서로서는 긴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으나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꿈이 좌절된다. 아서는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고, 청명한 목소리를 내어 그녀의 행동을 저지했다.
"잠깐, 저는 도둑 같은게 아닙니다! 선원을 희망해서 이 배에 탔어요! 부디 이 배의 탐험에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
증거, 증거라고 보일 만한게 있을까. 아서는 기다리라는 사인을 한 뒤 서둘러 가죽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신원을 증명할 만한 증거라던가 선원을 희망하는 증거 중 어느 것이라도 좋았다. 그러나 순간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바람에 배 안이 출렁였다. 아서는 바닥이 갑자기 기우는 것에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그 바람에 그가 가져온 물건들이 가방 밖으로 쏟아지게 되었다. 오랜 시간 바다를 생각하며 적은 가죽 공책과 나름대로 급하게 준비해 온 급전 몇 뭉치, 무엇보다 아서로서는 가장 중요했으며 감추고 싶은 아서 프랭크를 상징하는 가문의 목걸이가 그녀의 발 밑으로 쓸려가고 말았다. 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기우뚱 거리는 배 안에서 흔들리는 목걸이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윽... 저건...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
699 이름 없음 (nYt9t0h9M2) 2020. 8. 20. 오후 8:07:48>>698
"선원 희망은 무슨, 먼저 찾아와 부탁할 생각도 않고 숨어드는 걸 보니 틀림없이 죄 짓고 도망치는 밀항자...이런 맙소사."
그녀는 가방을 뒤지는 아서의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말로 방아쇠를 당겨버릴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파도가 쳐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점화 부싯돌이 떨어지기까진 약간의 유예가 있었다. 무거운 나무 상자에 발과 다리를 기대어 버티던 그녀는 자기 앞으로 밀려온 목걸이를 보고는 눈을 빛냈다.
"프랭크 가의 문장이군! 이런 건 예상 못 했는데 말이야. 만약 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 대신 폭죽과 색종이가 휘날린다면 그대도 내 당혹스러움을 이해하겠지."
어쩌면 프랭크 가의 사람을 납치했다는 누명을 쓰고 단두대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쨌건 아서가 시정잡배 무뢰배가 아닌 건 드러났으니, 그녀의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다.
그 유서깊고 명망있다는 프랭크 가의 공자께서 왜 이런 짓을 하시나? 배를 타고 싶으면 해군사관학교엘 갈 것이지. 굳이 이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
700 이름 없음 (wF9EszYPnI) 2020. 8. 20. 오후 10:53:59>>699
아서는 아차 싶다는 듯이 눈을 꾹 감고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을 집으로 돌려 보내겠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영원히 꿈을 꾸지 못한 채 화려하기만 한 새장 속에 갇힌다! 그러나 아서의 불안과는 달리 그녀는 누그러진 태도로 말을 건냈고 일련의 과정이 그토록 원하던 신원증명의 과정이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앗... 저... 이런 식으로 배에 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는 기회가 없어서, 제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총구는 거둬졌으나 총대를 쥐고 있는것은 여전히 그녀였다. 여기서 말 한 마디라도 잘못 놀렸다가는 가까운 항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은 배의 물살처럼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스릴 수 없는 파도라면 올라타야 한다. 아서는 첫 번째 관문에 그대로 몸을 맡기기로 했다.
"네, 저는 아서 프랭크입니다. 만약 새벽이 지나면 영영 떠나지 못하리란 생각에 급하게 배에 오른것이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험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저는 해류와 전염병을 공부했고, 짧은 기간이겠지만 쓸 수 있는 돈도 준비했으니까요."
아서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조금은 그 흔들림에 적응이 된 것이다. 아서는 잽싸게 가방의 내용물을 주워담더니 불안하고 경직된 눈초리로 마지막 물건을 집어들었다. 문제의 목걸이 말이다.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시겠죠. 프랭크 가문은 이번 결혼으로 가문을 더욱 키울 생각입니다. 바다로 떠날 생각 같은건... 영원히 꿈에 불과한 일이죠.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탐험선에 올라타고 싶었습니다! 한달이라도 좋아요. 부디 이 배의 선원으로서 저를 받아주시면 안될까요?" -
701 이름 없음 (fV6Wyt7K4g) 2020. 8. 21. 오전 12:37:26>>700
프랭크, 프랭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한 마디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프랭크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 이야기는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단계를 거쳐 그녀에게로 내려온 이야기였다. 아서의 무단승선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그녀 또한 적잖게 놀랐지만 어쩜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운명의 장난이란. 그녀는 새어나가는 미소를 가리기 위해 아서에게서 등을 돌렸다. 권총을 체스트 홀더에 도로 집어넣었다.
"잠깐 오해를 정정하자면 난 이 배의 선장이 아니네. 사실 선원도 아니지."
소설 이야기에서는 이런 식의 무대포가 흔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현실을 냅다 차버리고 꿈을 쫓아간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프랭크 가의 공자라면 더더욱 그렇지. 그녀의 눈에 아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꽤 괜찮은 것 같다. 마침 그녀가 하고 있는 일도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마침 이 배가 항로가 맞아떨어지길래. 조금만 타고 가다가 중간에 보급품과 같이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거지."
제비뽑기에 걸렸거든. 그녀는 덧붙였다. 아마 그녀가 타고 온 배는 조금 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내일 낮쯤에는 갈아탈걸세. 그리 알아두게."
아무튼, 그녀는 우회적으로 허락의 뜻을 내비쳤다. -
702 이름 없음 (O9jbegQ/fA) 2020. 8. 21. 오후 7:58:46>>701
"앗... 감사합니다!"
그는 서둘러 인사를 하려다 허겁지겁 주운 소지품이 떨어질듯 해 고개를 엉거주춤 숙이기만 했다. 듣기로는 그녀는 이 탐험선의 선원이 아니었다. 아마도 다른 배의 선장인 듯 했는데 앞뒤 말을 얼추 추스려 보면 승선을 허락받은 것 같다. 아서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슬그머니 입꼬리가 경련했다. 때문에 들뜬 기분을 추스리느라 잠시 침묵했으며 조금 뒤에야 질문을 꺼낼 수 있었다.
"그 배의 선장이신가요?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냐는 질문에는 무엇이든 할수있다는 자신이 내포되어 있기도 했다. 그는 나름대로 바다를 알고 있다고 착각중인 철부지였으니까. 가죽 가방을 잘 여미고 바다의 출렁임에 익숙해진 걸음으로 아서는 그녀에게 몇 발자국 다가섰다. 마치 충성이라도 맹새하려는 것 처럼. -
703 이름 없음 (fV6Wyt7K4g) 2020. 8. 21. 오후 11:09:31>>702
"글쎄, 적어도 직접 힘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걸세. 우리 선원들은 잠도 안 자고 일하니까. 자네가 끼어들겠다 하면 짜증을 내며 물어뜯으려 들지도 몰라."
뭘 하면 되냐니.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다. 말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서가 자신이 타고 온 배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일까? 그녀는 잠깐 자신이 타고 온 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선원과 장교들, 돛과 돛대와 해파리 촉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밧줄들.. 답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 배가 여간 환상적인 게 아니라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 조금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러지만 않아도 선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걸세. 그리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면서 머리를 긁적였다. 빛은 작은 등불 하나뿐이고 여전히 뒤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아직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상자 위에 잠깐 올려두었던 등잔을 도로 집어들고 나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다시 멀어진다.
"자기소개는 내일 환승이 끝나면 정식으로 하도록 하지. 여기서 하기엔 좀 기네. 말해야 할 것이 조금 많아서 말이야."
내일 정오일세. 잊지 말게.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창고 문을 나섰다. 황금색 빛이 조금씩 멀어져 간다. -
704 이름 없음 (VwEjTsCJPo) 2020. 8. 22. 오후 1:32:07어디에나 흔하고 평범한 시골 소녀 마리
조금 왈가닥이고 부모님 농사를 잘 돕지만 가끔은 할일을 빼먹고 시간 나면 한적한 호수에서 빵을 먹으며 새들을 관찰하는게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인 그런 여자아이...
하지만 별똥별이 하늘에 아름다운 선을 그은 날 즈음 이후 마리가 달라졌다.
적어진 말수와 은은한 미소 특히 몇일은 뭐든 멍하니 나사빠진 사람마냥 서서 무서울 정도로 남들만 쳐다보더니 요즘은 예전처럼 곧잘 남들과 이야기도 하고 농사일은 예전보다 더 능숙해진듯 남은 일을 로봇처럼 척척 빠르게 처리했다.
외적인 변화로는 그닥 예전의 그녀와 똑같았지만 왠지 기분상 그녀의 검은 눈속에 그날 지나간 유성같은 유리조각들이 반짝거렸다.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드디어 철이 들었다며 별 신경쓰진 않는다.
그녀와 같이 다니던 무리도 딱히 이상한것을 못느끼는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어느날 말을 건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거야?" -
705 이름 없음 (y95a3efXfM) 2020. 8. 22. 오후 11:32:08>>704 신경 쓰였다. 보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끄려 해도 자꾸면 마음에 걸렸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 아이의... 어깨에 떡하니 앉은 작은 메뚜기가. 도대체 겁도 없나, 눈치채이기만 하면 자기 몸보다 더 큰 손바닥에 전신 따귀를 맞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인간 몸에 떡하니 앉아있는거야. 그보다 마리라고 했던가, 인간보다는 작다곤 해도 손바닥 반만한 벌레가 자기 어깨에 여태껏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못 챌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곤 해도 너무 심하게 쳐다봤던 걸까. 왜 그렇게 쳐다보냐며 말을 걸어왔다. 뭐 말할 수밖에 없겠지.
"아, 네 어깨에 메뚜기가 앉아있는데 괜찮은가 해서 말이야."
새는 좋아하지만 곤충은 어떤지 모르니까 역시 진작 말해줄 걸 그랬다. 안타깝지만 많이 충격받진 않길 바라며 숨을 죽였다. -
706 이름 없음 (7jXHx32GVU) 2020. 8. 23. 오후 10:05:12아, 떨려, 떨려, 으아악, 지금이라도…아니……. (덩치에 맞지 않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심하게 다리를 떨고 있다. 얼핏 보이는 귀와 눈가엔 은색 피어스가 눈에 띄지만, 음침해보이는 분위기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느낌을 들게 만든다.) [ㄷㅈ젖ㅈㅂ법사야 나,도착햇는데 도착해잇어?ㅇ] (마른침을 삼키며 메세지를 보내고는 후, 하, 심호흡을 한다. 게임 속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대체 얼마만이지.)
-
707 이름 없음 (mXw49Ul6xM) 2020. 8. 23. 오후 10:41:16>>706
(작은 체구에 맞지않는 오버핏 티셔츠에 키높이 운동화를 신고도 키 160cm는 될까싶은 여자가 마스크를 끌어올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다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을 보낸다.) [뭐야. 추워? 왜 이렇게 떨어ㅋㅋ] [어. 난 도착해있어. 회색티에 키 작은 사람.] [손 흔들테니까 한번 봐봐. 나도 너 찾아볼게.] (휴대폰을 한손으로 들고 다른 손을 살짝 들어 흔들어본다. 누군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나 찾으려 주변을 살피며.) -
708 이름 없음 (7jXHx32GVU) 2020. 8. 23. 오후 10:49:06>>707
(진짜 떨려 죽을 것처럼 새파래졌던 안색이 당신의 메세지가 도착한 걸 보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린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는 지, 주변을 흘끔흘끔 훔쳐보면서 모자 챙을 살짝 들어올렸다. 벌써 도착해있다니, 키 작은 사람이라는 묘사에 살짝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소심하게 손을 들어보인다. 얼른 발견해줬으면. 옆사람이 스쳐지나갈 땐 화들짝 놀라며 다시 손을 집어넣어버렸지만, 다시 스르륵 꺼내놓는다.) -
709 이름 없음 (mXw49Ul6xM) 2020. 8. 23. 오후 11:05:15>>708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어색하게 손을 들고 다시 집어넣고하는 동작을 반복하고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직감적으로 그 사람임을 눈치채고는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 그 앞에 멈춰선다. 그리고 들고있던 핸드폰을 흔들어보인다.) 혹시 메세지로 추워 마구 떨고있던 사람이 맞나요? (이미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확인해보려는 절차로 씩 웃으며 농담을 던진다. 왠지 엄청 떨고있는것 같아서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
710 이름 없음 (7jXHx32GVU) 2020. 8. 23. 오후 11:18:06>>709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지. 슬며시 들어올린 손과, 그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새빨개진 얼굴을 가리고 있다. 드러난 얼굴은 눈 밖에 없지만, 화끈거리는 걸 감추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다 앞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헉,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든다.) …누, 누가 떨었다고 그래……. (막상 음성채팅으로만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니만큼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역시 달랐다. 기어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들어올렸던 손과 고개를 같이 폭 숙인다.) …안녕, 법사. (묻힌 얼굴 틈 사이, 두 눈동자 만이 당신을 흘끔 응시한다.) -
711 이름 없음 (mXw49Ul6xM) 2020. 8. 23. 오후 11:36:06>>710
지금도 떨고있구만, 뭘. (킥킥 웃으며 판단에 확신을 가졌다. 음성채팅으로 대화할때에는 이렇게 떨진 않았던것 같았는데. 게임 밖에서는 낯가림이 있는 편인가? 흠. 속으로 생각하며 의자를 꺼내어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목소리의 인사를 알아듣고는 솔직하게 빵 터져버린다.) 아하학! 게임 밖에서도 법사 소릴 들으니 뭔가 웃기네. 그럼 나도 그렇게 인사해줄까? 안녕, 전사. (큭큭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다시 손을 흔들어준다. 그리고 간신히 보이는 눈동자만 쳐다보다가) 그래서, 마실것 좀 시켰어? (여전히 긴장과 어색함을 풀어줄 생각인지 가볍게 화제를 돌린다.) -
712 이름 없음 (7jXHx32GVU) 2020. 8. 23. 오후 11:52:30>>711
(흘끔, 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다가, 다시 흘끔, 그리고 물컵을 만지작거렸다가. 어쩐지 불안함과 긴장이 반쯤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다 당신이 웃음을 터뜨리자 괜히 시선을 피하며 입을 비죽 내민다. 전사라고 부르는 소리에 본인도 웃고 말았지만.) 너나 나나, 실명 같은 오프 이야기는 거의 나눈 적이 없잖아. 기껏해야 고민 이야기 정도고. (눈빛이 마주치면 갈 곳 잃은 눈빛으로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어쩌라는건가 싶다. 당신의 물음에 대답하려다 발음이 꼬여 작게 헛기침을 한다.) 아니, 아직……카페는, 그게, 오랫만이라서…. (게임 속에서 당당하던 그 전사의 모습이 맞는 걸까. 자신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제 손가락만 꼼지락거린다.) -
713 이름 없음 (iJaZuHfczU) 2020. 8. 24. 오전 12:07:27>>712
아. 그건 그래. 아무래도 게임 속에서 실명까지 얘기 나누기엔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지. (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함을 표현하면서도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는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놓치지않고 관찰한다. 여전히 아직 어색한건가? 뭐. 그럴수 있지. 게임 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의문을 가질법도 하나 다 이해한다는듯 가볍게 미소만 짓는다.) 카페는 오랜만이야? 그럼 같이 주문하러 가자. 내가 쏠게. 만나서 반갑단 기념으로. 왜, 게임 속에서도 선물 주고받았잖아? 따지자면 그런거지. (씩 웃으며 일부러 게임으로 비유하여 불안감을 풀어주려한다. 휴대폰으로 결제 준비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따라오라는듯 바라본다.) 혹시 먹고싶은거 있어? -
714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전 12:26:49>>713
…그래서, 오프하자는 말에 법사가 수락할 줄은 몰랐어. 사는 곳이 가까웠던 건 알고있었지만……아, 탓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는, 아니, 그냥, 잠깐 보는 거니까… (횡설수설하던 말소리가 점차 줄어들다가 서서히 고개를 숙이며 아무말이나 해버린 제 탓과 함께 미간을 손으로 짚어버렸다. 당신의 가벼운 미소에 흘끔 올려다보다가 어색하게나마 작게 미소짓는다.) 나, 내가…아, 그럼 내가 마실 거 사면…살게. (당혹스러운 눈동자로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받기만 하는 건 싫으니까, 예전에 당신과 선물 공세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과는 둘 다 너덜너덜한 빈털털이가 되어버렸지만. 당신이 일어서자 엉거주춤 자신도 일어섰다. 새삼 다부지고 덩치가 있다.) 나는…… (말을 줄이며 흘끔흘끔 진열장 안의 마카롱을 쳐다본다.) 법사는, 아아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신다는걸 들었으니까.) -
715 이름 없음 (iJaZuHfczU) 2020. 8. 24. 오전 12:44:33>>714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큭큭 웃는다.) 뭐, 겸사겸사지. 전사 말대로 사는곳도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도 전사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으니까. 전사랑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말을 들려주고는 이어지는 당혹스러운듯한 반응에는 단호히 손을 척 내밀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다.) 아니야. 이건 내가 살거야. 말리려 해도 소용없어.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거니까 전사는 맛있게 먹기나 하면 돼. 알았... (씩 웃다가 의외로 다부진 덩치를 처음 보고는 놀란것처럼 말을 끊고 자연스럽게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뜬다.) ....앉아있어서 몰랐는데 체격 좋구나. 역시 키도 나보다 컸네. 아무튼, 기억하고 있었네? 감동인걸. 거기에 마카롱도 추가할거야. 전사는 뭐 마실래? (키득키득 웃으며 자연스럽게 당신을 위한 마카롱도 포함한다. 금방이라도 계산할 자세를 취하며.) -
716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전 12:59:06>>715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동자가 핑글 돌았다.) 이상한 소리. 날, 나를 왜… (챙을 푹 내려 표정을 숨겼다. 왜 저렇게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지. 장난으로 내뱉은 오프 제안에 흔쾌히 수락한 데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니, 법사가 더 멀잖아. 내가 살…건데……. (이쪽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할 말을 잃고말았다. 카운터 앞에서 주문하는 다른 사람들과 직원의 모습에 다시 안색이 새파래졌다. 분함 섞인 애타는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법사 캐릭터, 키컸던 이유가 있었구나. (체격 좋다는 말에 부끄러운 기색을 내비치다, 심통이 나서인지 얄궃은 말을 했다. 마카롱까지 산다는 말에 금새 화색이 돌았지만. 숨겨지진 않지만, 당신 뒤에 숨듯이 서서 메뉴판을 빤히 바라보다 식은땀 줄줄 흘리는 얼굴로 돌아본다.) …법사랑 같은 걸로. -
717 이름 없음 (iJaZuHfczU) 2020. 8. 24. 오전 1:16:56>>716
뭐야. 이게 뭐가 이상해? 그럼 전사는 나 안 보고싶었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니까 오프하자고 했었던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다고 한거지. (여전히 아무렇지않게 대답하며 씩 웃는다.) 오늘은 내가 사는거고 다음번엔 전사가 사는거지. 이럼 됐지? (그러나 당신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안색이 새파래진것이 보인다. 손을 뻗어 괜찮다고 달래주듯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주려고 하며.) ..그러니까 분하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땐 더 맛있는거 사달라고 할테니까 각오하고. (일부러 농담을 던지며 큭큭 웃다가 입을 삐죽인다.) .....조용히 해. 게임에서나마 내 꿈을 이뤘을뿐이야. (괜히 그런 소리를 하다가 당신의 상태를 보고 얼른 주문과 계산을 끝마친다. 진동벨을 받아들고는 당신에게 미소를 보이며 안심시켜주려한다.) 자. 끝났어. 어서 자리로 돌아가자. -
718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전 1:36:01>>717
(당신의 말은 정론이다. 하지만 자신이 옹졸한건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볼품없는 자신인 만큼, 되도록이면 게임 속 상대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게 자신의 철칙이었다. 물론, 그 철칙을 처음 깨게 된 것은 당신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떤데? (조그맣게 중얼거린다.) 다음에……. 응. (이미 당신이 다음에 또 자신을 만나줄까 걱정될 뿐이었다. 자신이 온라인 속과는 달리 재미없는 사람이란건 이미 알고있었으니까. 당신의 토닥거림에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지만 역시 분함이 가시질 않는지 고갤 돌려버렸다.) 굳이 안커도 될텐데. 그대로도…좋으니까. (입을 삐죽이는 모습에 다급히 노선을 바꿨다. 진동벨을 보고는 긴장된 어깨와 표정이 살짝 풀어졌다.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 긴장 가득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어제, 공대…괜찮았어? 나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으니까…. -
719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전 1:37:55>>717
#피곤해서 먼저 자러갈게! ㅠ0ㅠ 굿밤! -
720 이름 없음 (iJaZuHfczU) 2020. 8. 24. 오전 2:01:45>>718
실제로 만나보니까? 흠. (당신을 다시 올려다본다.) ...온순하고 커다란 곰 같은 느낌? 게임 속에서도 뭔가 공격력 맥스인 곰 같은 느낌이긴 했었지만. (키득키득 웃다가 똑같이 묻는다.) 나는 어때? 실제로도 별다를바 없으려나? (어깨를 으쓱이며 제 자신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그리고 다급히 방향을 바꾼 당신의 말에 다시 고개를 든다.) 뭐야. 너 키 작은 캐릭터 좋아해? 그래도 큰게 더 좋지않아? 나는 작은것보단 큰게 더 좋더라구. 내가 이따구라서 그런가. (농담하듯이 큭큭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의외로 당신이 먼저 얘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고개를 도리도리한다.) 아니! 완전 힘들었어!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뛰어서 그런지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완전 고생했다구. 전사랑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번엔 꼭 같이 하자. 전사는 실력도 좋으니까 다들 반겨줄거야.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칭찬한다.)
#응 잘자! 굿밤!^-^ -
721 이름 없음 (DI0H5m23pQ) 2020. 8. 24. 오전 2:10:34>>705
"메뚜기....?"
소리를 지르거나 충격에 새하얗게 질려 얼어붙을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어께 위의 벌레를 눈으로 보지도 않고 손으로 잡아챈다.
뒤에도 눈이 달린듯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 인간의 것이 아닌듯 하다.
잡은 벌레를 무심히 쳐다보는 마리
이리저리 돌려보고 반짝이는 벌레의 겹눈속에 비치는 이그러진 세계 모습에 신기해한다.
"아 알려줘서 고마워"
늦은 감사를 전하는 그녀
가득 차오르는 기쁨의 미소대신 적당히 둘러대는듯한 미소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위기여서 썩 기분나쁘진 않다.
다만 마리였다면 짓지 않았을 표정이다.
그리고 그녀는 가지고 있던 메뚜기를 찢어 땅바닥에 버린다.
찍 하고 초록색 체액이 그녀의 손을 적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밭일을 계속한다.
-
722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후 9:42:44>>720
(분명, 자신의 첫인상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다. 귀에도 입술에도 눈 아래에도 피어싱이 있고, 말을 먼저 꺼내는 편도 아닐 뿐더러 당신이 말한 대로 덩치가 있는 편이었으니까. 그래도 온순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 살짝 감동을 느끼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여태껏 쓰고있던 마스크를 살짝 끌어내렸다.) 법사는…좀 더 차분하네. 맨날 인싸라고 놀렸는데, 진짜 인싸 같아서 어쩐지 분해. (툴툴거리다 당신의 질문에 뭔가 답하려던 것처럼 입을 옴싹거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모습이라서 좋은 것 뿐인데.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고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크든 작든, 그다지 별 차이 없다는 뜻이었어. …나 거기 사람들 한 명도 모르는데. 애초에 레이드 처음 뛰게 된 것도 법사랑 만나서였으니까. (띄워주지마, 부끄러운 듯이 작게 중얼거리다 테이블 위의 진동벨이 울리자 화들짝 놀랐다. 아 참, 지금은. 벨을 집고 호다닥 일어난다.) 내가 가져올게. (벨을 집고 성큼성큼 카운터로 간다.) -
723 이름 없음 (iJaZuHfczU) 2020. 8. 24. 오후 10:25:47>>722
(어쩐지 감동받은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역시 겉모습과는 다르게 온순한 곰같단 말이지. 왠지 귀엽네. 그런 생각을 하며 큭큭 소리죽여 웃다가 어깨를 으쓱인다.) 나도 완전 인싸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분해할 필요없어. 나도 전사랑 똑같아. (눈을 마주보며 가볍게 미소지어준다.) 그렇구나. 나는 되게 큰 차이가 날거라 생각했거든. 일단 보이는 세상의 높이부터가 달라지잖아? (잠깐 키가 큰 기린처럼 목을 길게 빼며 장난을 치다가 큭큭 웃는다.) 뭐, 사실 나도 그렇게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띄워줄거야. 전사는 정말로 잘하니까. (아무렇지않게 다시 칭찬을 전하다가 진동벨이 울리자 같이 놀란다. 그러나 재빨리 카운터로 가는 당신을 보며 더 놀란다.) ...괜찮을까? (아까 보니까 엄청 불안해하던데. 그래도 일단 당신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
724 이름 없음 (UKtzamExpo) 2020. 8. 24. 오후 11:36:45>>723
(자신과 같다니, 전혀 안같은 거 같은데. 얇은 입술이 애매하게 호선을 그렸다. 하지만 당신의 미소에 곧 눈동자가 갈 곳 잃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눈빛이랑, 제스쳐 같은건 법사 그대로야. …말투도, 평소처럼 상냥하고. (생각해보면 자신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을 것이다.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신물이 난 채 날이 선 말투였으니까. 당신이 목을 빼는 행동을 취해보이자 작게 웃으며 적응 안돼, 라고 중얼거렸다.) 법사야말로 언제 그런 곳에서 스카우트가 온 거야. 이름 유명한 곳이잖아. 나는…딱히 괜찮아. 그 파티에 전사 자리가 비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그쪽에서 자신의 소문을 듣고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언질을 두고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진동벨을 들고 가서…….) …….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어쩐지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인 것 같고, 진동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식은땀에 놓칠 뻔 한걸 간신히 붙잡아들고, 음료를 받는 곳으로 갔다. 있지도 않은 수군거림이란걸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갔다왔어. (당신에게 돌아왔을 땐 이미 기력이 쭉 빨린 상태였다.) -
725 이름 없음 (e5mjwJ3rLs) 2020. 8. 25. 오전 12:07:41>>724
그래? 신기하네. 나름대로 꽤 차이나지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상냥한건 전사도 마찬가지야. 물론 처음에는 좀 무섭긴 했지만, 뭐, 그거야 처음 보는 사람을 쉽게 믿기는 어려우니까 이해해. 더구나 게임 상이었으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의외로 당신의 첫인상은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람도 봤었으니까. 괜히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잠깐 입을 꾹 다문다. 그러나 다시 당신에게 웃어보인다.) 그냥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필요하다해서 가보긴 했지만.. (말을 멈춘다.) .....강요하진 않을게.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원한다면 말해줘. (당신을 배려해서 그 정도로만. 그리고 자리를 떠난 당신을 걱정스럽게 기다리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하여 씩 웃으며 반겨준다.) 어서와! 전사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게 되었네. 수고했어. 자, 여기 퀘스트 완료 보상이야. (당신의 앞에 음료와 마카롱들을 놓아준다. 기력을 채워주는 마법이 걸려있다구, 하고 농담을 던지며.) -
726 이름 없음 (R3UXYZ4Gkk) 2020. 8. 25. 오전 1:20:14>>725
그런 건 이해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표정은 어쩐지 슬퍼보이면서도 심란해보인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긁으며 눈꼬리를 떨어뜨린다. 흘끗 본 당신의 모습이 어쩐지 딱딱해보였지만 금새 풀리는 모습에 눈을 깜빡거린다.) 응. 법사도…적응력 대단하니까 금새 익숙해질거야. 가, 같…아니. 아냐. (같이 던전 갈 시간이 준 건 서운하지만, 라고 하는 말은 쑥스럽기도 해 꺼내지 못하고 입을 우물거린다.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만들 정도의 적응력이라면, 분명 빈말은 아니다.) 법사가 산 거잖아. 다음엔 꼭 내가 살테니까… (당신이 웃으며 반겨주자 피로에 쩔은 얼굴이라도 금새 화한 미소를 찾아왔다. 그리고 눈 앞에 놓여진 마카롱에 두근거리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처음 먹어봐. …그거 알아? 요즘 요리사 길드에서 마카롱 레시피도 들여오려고 한다더라. 알아본 건 아니고, 우연히 들은건데… (혹여 이런 걸 좋아하는걸 들키면 큰일나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꼼질거리다, 마카롱을 집어들어 한입 베어문다. 은은한 단맛에 눈동자에서 별사탕이 터지는 것만 같다. 우물거리며 당신을 바라본다.) 진, 진짜 맛있어. 법사도 얼른 먹어봐. -
727 이름 없음 (pIjpIdE2LQ) 2020. 8. 25. 오전 1:33:46>>703
멀어져 가는 등불이 아서에게는 마치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순간 배가 다시 흔들렸고 감상에 빠질 시간 없이 구르는 화물을 피해야만 했지만. 새벽의 바다는 처연할 정도로 먹먹한 기색이 묻어났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빠지게 된다는 여러 바다 괴물의 설화가 신빙성 있게 느껴질 쯤 아침의 빛이 창고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아침이다, 늦지 않았을까? 아서가 슬그머니 창고 밖으로 나오자 선원의 날 선 눈길과 마주친다. 낯선 이방인이 배에 타고 있었으니 당연한 반응... 그러는 사이에 아서는 멱살을 잡힌채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지? 처음 보는 선원인데..."
"아 저기... 이번에 환승하는 배의 선원입니다..."
아서가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자, 마침 배에 오르려는 그녀가 보였다. 아서는 급하게 손을 흔들며 자신이 무고하다는 듯이 웃었다.
"앗... 선장님! 저기 저 배인가요? 저희가 탈 배입니까?"
#늦어서 안 이을지 모르겠지만... -
728 이름 없음 (hANJ2FeHAk) 2020. 8. 25. 오전 4:30:36>>721
안 놀라네. 원래 벌레를 좋아하는 친구였나보다. 잘 된거지, 순간적으로 내 고막을 진심으로 염려했다구... 신기해하는 모습에 안도하자니 알려줘서 고맙단다. 적당히 둘러대는 듯이 웃는 게 좀 의아했지만, 내 알바 아니니까 넘기기로 했다. 이제 곧 퇴근시간이라 해도 순찰이 끝나지 않았기도 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근무중에 잠시 대화하는 거야 큰 일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시간을 빼앗겨도 곤란하다.
"고맙긴, 많이 안 놀라서 다행이네. 그럼 힘내~"
대충 인사를 건네고나서 곧바로 가던 길을 갔다. 뒤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려니 했다. 가여운 메뚜기가 유명을 달리한 것 같은데, 저 친구와는 거리를 둬야겠다. 벌레는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생물을 학대하는 인간 치고 같은 인간에게 잔학하지 않은 인간 별로 못 봤으니까. 아이의 행동을 훈계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내 영역은 아니다. 내 영역이라 하면 역시... 오늘 먹을 저녁식사려나. 마침 감자를 사다 쟁여놨으니 오븐에 구워먹어야지. 퇴근하자마자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기대감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혀졌다. -
729 이름 없음 (e5mjwJ3rLs) 2020. 8. 25. 오전 11:52:41>>726
기분 나빴어? 그랬다면 미안해. 그래도 전사의 첫인상은 절대로 나쁘지 않았어. 정말이야. (믿어달라는것처럼 당신과 눈을 마주치려하며 미소를 지어보인다.)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전사랑 같이 던전가는것도 소홀히 하진 않을거야. 전사랑 같이 싸우면 호흡도 잘 맞고 재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랑 놀아줄거지? (몸을 앞으로 숙이듯 기대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나름대로 당신이 숨긴 뒷말을 눈치채어 나온 진심어린 배려의 농담이었다.) 응, 다음번엔 기대할게. 그나저나 그런 소식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진짜야? 신기하다! 전사만 괜찮다면 나중에 같이 놀러가볼래? (키득키득 웃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모금 마신다. 그리고 마카롱을 먹는 당신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찬가지로 마카롱을 하나 집어들어 한입에 넣고 우물거린다. 다시 음료까지 한모금 마시고는) 정말 맛있네! 전사는 단거 좋아해? 난 좋아하는데. (왠지 주눅들어 있는듯한 당신을 위해서인지 아무렇지않게 먼저 대답하며 씩 웃어보인다.)
#미안....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자버렸다..... ㅠ-ㅠ
#사실 내가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알려줬으면 해!^-^ -
730 이름 없음 (ChtOK6c5AE) 2020. 8. 25. 오후 3:30:24>>727
그녀는 이 배의 선원들과 함께 자신의 보급품들을 보트에 옮기고 있었다. 흔히 범선 옆구리로 내리는 그런 소형 보트다. 하지만 그녀와 선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 이 배의 보트는 아니고 그녀가 모선에서 따로 몰고 온 보트인 모양이다. 그냥 모선을 통째로 끌고 와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처리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미스터 프...아니 아서! 이리 타게! 설마 어젯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진 않았겠지!"
바나나가 가득 든 망을 휙 던지자 보트 위에 쌓인 짐들 사이로 툭 떨어져 안착한다. 두 사람을 태워다 준 배는 제 갈길을 가고, 두 사람은 바다 위에 덩그러니 놓인다. 해무에 가려 보였다 말았다 하는 또 다른 배의 윤곽이 두 사람이 조난당하지 않았다는 위안이었다.
"저 배일세. 지금은 잘 안 보이는군. 하지만 앞으로 지겹게 타게 될 배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네."
그녀는 느긋하게 노를 젓는다. 그러다 뭔가가 생각났는지, 천천히 아서에게 뜻 모를 질문을 한다.
"자네, 혹시 홀린 고성을 본 적 있나? 언덕 위에서 웅장한 자태로 옛 홀린 가문의 영지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듣자하니 그곳은 이제 오컬티스트들의 성지 비슷한 곳이라는군. 하긴 홀린 가문이 그쪽 분야에서 주옥같은 전설들을 만들곤 했었지."
"그게 하도 불경한 전설들이라 프랭크 가문을 비롯한 주변 영주들에게 몰매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말일세..." -
731 이름 없음 (yS6MYHR7mE) 2020. 8. 25. 오후 4:56:02>>730
"지금 갑니다!"
서둘러 가방을 갈무리 하고는 여전히 미심쩍다는 표정을 짓는 선원에게서 벗어나 얼핏 보아도 작은 크기의 보트에 올라탔다. 이내 탐험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떠나가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 하다. 그러나 자신이 직면한 모험은 아직 작은 발돋움에 불과하다. 아서는 수면 위에 지는 배의 흔적을 주워삼키며 배가 있음을 감각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란 사실에 절로 긴장되었던지, 괜시리 가죽 가방의 끈을 메만지며 잔 침을 삼켰다.
"홀린 가문이라면... 한때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기이할 정도로 짧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상 알고 있다기 보다는 주워들었다는 정도이죠."
가정교사가 흘리듯이 꺼냈던 말을 아서는 성년이 된 지금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그녀에게 답했다. 그의 가정교사는 모험을 좋아하는 아서의 성정을 잘 이용해 종종 흥미로운 소문들을 수업 중간에 유흥 삼아 흘려주고는 했던 것이다. 그랬으나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와 달리 기이하게 짧았다. 마치 무언가 감춰져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 처럼...
"갑작스레 멸문한 것도 불경한 물건에 손을 댔다던가, 귀신의 미움을 샀다던가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뿐이라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십니까?" -
732 이름 없음 (R3UXYZ4Gkk) 2020. 8. 25. 오후 8:47:09>>729
(기분 나빴냐는 말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그저 걱정이 된 것 뿐이니까. 자신이 지금껏 보아왔던 당신의 그 상냥함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면, 온라인 상의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당신은 알아서 잘 해내겠지. 자신이 봐온 당신의 모습은 그저 게임 속 일부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미소에 조심스레 미소로 답해보인다.) …법사만, 괜찮다면……응. (당신의 농담 속에서 전해져 온 진심에 답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고르고 골라 나온 말은 어찌보면 한심하고 소심한 답 뿐이었다. 그렇구나. 앞으로도 같이 있어줄 거구나. 마음 속 매듭이 슬며시 풀어진 느낌이 들어 당신이 모르도록 고개를 숙인 채 안도의 미소를 지어보인다.) 좋아. 게임 속에서 사는 건 이거랑 별개니까, 먼저 계산하는 쪽이 이기는 걸로. (원래부터 가고싶기도 했고, 좋아하는 당신과 함께이기도 하니 고개를 여러번 끄덕거렸다.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한모금 마셨다가 처음 겪어보는 쓴맛에 작게 기침을 했다. 왜 이런 쓴 음료를.) 단 거…좋아하는데, 사러가기 좀 힘들어서. (마카롱을 다시 한 입 먹으며 머쓱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래서 법사 덕분에 먹어볼 수 있어서…고마워. 만나주겠다고 한 것도. (눈동자만 데굴 굴려 당신을 바라보고, 부끄러운 나머지 다시 아메리카노 잔을 양손으로 집어들었다.)
#괜찮아! 나도 어제 늦게 답레 해버렸고 ;ㅡ;
#사실 게임에 관해선...요즘 같은 온라인 게임? 아니면 가상현실 게임? 둘 중 고민했었는데 마카롱 얘기가 나오면서 후자로 정해진 것 같아...! 막 정해진 건 없으니까 편하게 설정 정해줘도 괜찮아 ^~^! -
733 이름 없음 (e5mjwJ3rLs) 2020. 8. 25. 오후 9:31:07>>732
(고개를 젓는 당신을 보며 역시 당신이야말로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태껏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게임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럼 약속한거다? 이래놓고 나랑 안 놀아준다면 삐질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으며 이런 농담도 던질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안도의 미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승부하자는 거지? 좋아! 절대 안 질거야. 누가 이길지 두고보자고, 전사. (게임 얘기가 나오니 왠지 약간 당당해진것 같은 당신의 모습을 보며 씩 웃는다. 당신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기침하는 모습에는 손으로 입을 가려 애써 웃음을 삼켰지만.) 고맙긴. 전사 덕분에 나도 이렇게 맛있는걸 먹게 되었는걸.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단 거 먹고싶을때가 생기면 나 불러. 같이 사러가자. 그리고 전사를 보고싶었으니까 만나겠다고 한거지. 그러니 나도 고마워. 나를 만나러 나와줘서. (당신과 똑같이 말한 후,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마주본다. 그리고 당신의 아메리카노 잔으로 시선을 내린다.) ...아메리카노 너무 쓰지? 다른 음료 시킬걸 그랬나보다. 아니면 시럽이라도 넣어 마실래? (왠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가상현실 게임이구나. 알았어! 그래도 내가 게임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용어 실수나 그런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줬음 해!^-^ -
734 이름 없음 (ChtOK6c5AE) 2020. 8. 25. 오후 9:53:29>>731
"그건 이유가 아니네. 홀린이 무너진 이유는 주변 영주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말하는 불경한 물건 등등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었지."
"그래도 홀린은 잘 버텼었네.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 프랭크의 그 명장만 아니었으면. 명장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일걸세. 아마도."
해무가 점점 짙어진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닷물 찰박거리는 소리뿐. 숨을 쉬면 은은한 짠내가 느껴진다. 그녀는 아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직계고 방계고 사용인이고 모두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와중에……. 아, 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본론을 얘기하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홀린 가문의 맥은 아직 끊기지 않았다네."
그녀는 팔이 아픈지 노 젓기를 그만두었다. 시선을 내리깔고 알싸한 손가락과 팔뚝을 매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는 저 혼자서 계속 움직인다. 끽, 끼익. 노는 곧 부러질 것처럼 신음한다. 그녀는 허리를 돌려 난간에 손을 얹고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복수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네. 다만 프랭크 가의 공자가 내 배에 탄다는 상황 자체가 흥미로웠을 뿐이야. 약속대로 우리는 탐험을 떠나게 될 걸게. 그리고 당신은 세상의 베일에 가려진, 온갖 기상천외한 것들을 보게 되겠지. 심연 속의 존재들과 그 부산물…."
일순간 해무를 가르고 회남색 범선이 등장한다. 얼음 위 스케이트의 달인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불길하고 음산하다. 흘수선 밑에 크라켄이 달라붙어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다. -
735 이름 없음 (R3UXYZ4Gkk) 2020. 8. 25. 오후 10:32:07>>733
(삐진다는 당신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당신의 모습은 똑같은 당신이었으니까, 눈꼬리를 휘어 화하게 웃었다.) ……약속.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보인다. 부끄러움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계산 속도 때문에 민첩을 올리고 싶어지는건 처음이야. 미리 말해두지만 마법은 금지야. (저번에 한 번 당한게 있어 괜히 입을 비죽 내밀고 당신을 장난스레 흘겨본다. 그러곤 새삼 놀란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게임 속에서처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또 같이 가자고 해도 된다는거야? (이 부분은 당신의 따듯한 미소에도 걱정이 되는 지, 몇 번이고 곱씹다가 뒤늦게 내뱉은 질문이었다. 아무리 당신이 상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으니까. 그러니 당신의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에, 애매한 미소를 지어보일 수 밖에 없었다.) 아, 아냐. 괜찮아. 마카롱이랑 같이 마시니 괜찮은…걸. (당신의 미안해보이는 목소리에 눈을 크게 하고는 빨대로 쫍쫍 마셨다. 그 뒤,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법사는 오늘 저녁에도, 접속할거야? 아니면, 공대 약속 있던가? (어느새 아껴먹던 마카롱을 하나 해치우고 난 후, 테이블을 만지작거리며 당신을 흘끗 바라본다.)
#좋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픽크루를 쪄왔어!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_^! -
736 이름 없음 (e5mjwJ3rLs) 2020. 8. 25. 오후 11:16:05>>735
(아. 웃었다. 당신의 화한 웃음을 똑바로 마주하자 뭐라 할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더군다나 눈을 피하지않고 보고있는 당신을 멍하니 보고있자니 그만 반응이 조금 느리게 튀어나와버린다.) ...아. 아. 응! 약속.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당신의 손가락에 걸어본다. 살짝 얽히는 손가락이 왠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어 괜히 웃어보이는것으로 넘기려 한다.) 아. 이런. 이제 꼼수도 안 통하는거야? 너무해- 법사는 마법을 쓸수밖에 없는걸? (괜히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이고는 큭큭 웃으며 음료를 마신다. 이제 불안이 좀 풀렸는지 아까보다 편해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응. 물론이지. 물론 전사가 괜찮다고 한다면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전사는 다음부터는 나 안 볼거야? 난 다음번에도 전사 보고싶은데. (마음을 숨기는것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는 한손으로 턱을 괴며 씩 웃는다. 물론 일부러 농담조로 말하여 분위기를 풀어주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애쓰는 당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다가 자세를 똑바로 한다.) 억지로 먹진않아도 돼. 처음에는 먹기 힘든게 당연하니까. 나도 그랬거든. (가볍게 미소지어주다가 잠깐 고민한다.) ....글쎄? 잘 모르겠어. 공대 약속은 없긴 한데 오늘 저녁에는 잠깐 게임은 쉬고 좀 걸을까 해서. 산책 겸. (잠깐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보다가 다시 당신을 바라본다.) 전사는 어때? 오늘 저녁에도 접속할거야?
#픽크루 이미지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잘생겼다 ㅠ0ㅠ ㅠ0ㅠ 행동은 귀엽고 이미지는 멋져서 뭔가 더 귀여워 ㅋㅋㅋㅋ
#픽크루 고마워! 덕분에 상상하기 더 수월해졌어!^-^ -
737 이름 없음 (TGxjOVG302) 2020. 8. 26. 오전 12:15:28>>736
(당신의 반응이 애매하게 느렸지만 거기에 대해선 그저 의뭉스러운 표정만 잠깐 지어보였을 뿐, 새끼손가락을 맺고 살짝 흔들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니,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인간관계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지금에도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 같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기에, 지금 자신의 이 평온함은 온전히 당신의 새끼손가락에서 전해져 온 것이리라.) 그리고 아는 지인 가게에 가서 미리 계산해두는 것도 금지. …아무튼 금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얄밉다는 듯, 당신을 흘겨보며 손가락으로 소심하게 X자를 취해보였다.) 아, 아니. 안보고싶은게 아니라, 보고싶, 으. 그게…난, 괜찮으니까……. (갑작스런 당신의 기습에 턱을 괸 채 이쪽을 바라보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휙 고개를 돌려버린다. 아마 새빨개져있을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폭 숙인다. 그리고, 조그맣게 중얼거린다.) 나도……종종, 법사랑…보고싶어. (괜히 머쓱한 나머지 손가락 장난을 치다 당신의 위로에 흘끗 바라본다.) …왜 쓴 걸 마시는거야?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묻다, 다시 한 번 한 모금 마신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 자신도 좋아하도록 노력해보고 싶어서. 아직은 조금 힘들지만.) 아, 나는…그럴 예정이었는데, 딱히, 안해도 괜찮, 고. 약속은 당연히, 없으니까…. (당신을 따라 창밖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가, 대뜸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요약하자면 이른 바, 당신과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뜻이지만 불가피하게 전해지기 어려운 방법을 택했다. 이미 비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아쉽다는 듯이 빤히 내려다본다.) 그럼……이제, 돌아갈까?
#ㅋㅋㅋ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워! 제대로 전해졌다면 다행이야! -
738 이름 없음 (f/LGWekWdk) 2020. 8. 26. 오전 12:16:02>>728
작별을 말하는 그가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본다.
자신이 이상하다는것을 느낀걸까? 다만 상관없다.
그는 알아도 신경쓰지 않는듯 보이니까
산을 느긋하게 넘어 구름속으로 들어가는 빠알간 노을 뒤로 그녀가 역광으로 서있다.
분명 그림자져 보여야 하는 그녀의 눈이 선명하게 빛나는듯 하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실종되었다.
안타깝게도 몇일뒤 마리의 시체가 호수에서 발견 되었다.
그녀의 시체는 어째서인지 몇달은 지난듯 푹 썩어 있었으며 또 특이한점은 안에서 무언가 찢고 나온듯 양쪽으로 시체가 벌어져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더운날이라 썩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단순히 산짐승이 시체를 회손한거라며 쉬쉬 입을 모았지만 다들 머릿속으로는 혼란이 가득 차올랐다.
이미 몇달전에 죽었다고? 그럼 이제껏 있었던 마리는 누구지?
시체는 왜 이렇게 찢어져 있지? 마치 안쪽에서 누가 태어난것 마냥...
하지만 무슨 상관일까 나하고는 관련없는 일일텐데
내 영역도 아니니 내 시간을 뺏길순 없지
모두 그렇게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종종 이 마을에선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래 최후의 한명이 남을때까지....계속
[END 1 : 눈먼자들의 마을] -
739 이름 없음 (mcdTGWrxrQ) 2020. 8. 26. 오전 1:02:44>>737
(이상한 기분이다. 그저 새끼손가락을 걸고 살짝 흔들뿐인데. 어쩐지 닿아있는 손가락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느낌이라, 괜히 웃으며 대신 당신의 목소리와 그 말에 집중하려한다.) 그것까지? 너무해, 진짜. 아무튼 금지인게 어딨어? 너무해- 그럼 도대체 뭘 하란거야! (일부러 장난스럽게 찡찡거리며 테이블 위에 엎드린다. 표정은 큭큭 웃고있었지만. 그러고 난 후 새빨간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귀엽다는듯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본다. 그리고 아예 두손으로 턱을 괴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그치? 전사도 나 보고싶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싶어지면 언제든지 불러줘. 시간되는대로 꼭 나올게. (그러고 다시 음료를 몇모금 마시다가 잔을 내려다보며 잠깐 고민한다.) .....음. 글쎄. 예전에 누군가가 이걸 좋아했어서? 그래서 따라서 마시다보니 결국 나도 계속 이걸 마시게 되더라구. (잠깐 씁쓸한 미소를 짓던 입가가 다시 잔에 가려진다. 어쩌면 당신과 비슷했을지도. 왠지 당황한듯한 모습을 보이는 당신을 지켜보다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돌아가자. 그 전에, 잠시만. (가방에서 포스트잇과 펜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떼어 남은 마카롱의 포장 위에 붙이고 그것을 당신에게 내민다.) 자. 여기 내 번호야. 혹시 전사도 이따가 저녁 산책 같이 하고싶어지면 연락줘. 강요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말고. (살짝 윙크하고는 짐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덕분에 정말 잘 전해졌어!^-^
#나도 기다리면서 픽크루 한번 쪄봤어! 간단하게 찌긴 했는데 법사(현실세계)는 대충 저런 이미지라고 생각 중이야!
출처는 https://picrew.me/share?cd=4J3TnIfDdD #Picrew #ガオmaker -
740 이름 없음 (TGxjOVG302) 2020. 8. 26. 오전 1:44:56>>739
(찡찡거리는 당신의 반응에 흠칫거렸다. 귀여워. 현실의 당신은 온라인의 당신보다 좀 더 밝고, 어리광을 잘 피우는 것 같았다. 아니면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일까. 어느 쪽이든, 웃음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힘이 들어간 눈매도 조금 더러워졌다.) 정정당당하게, 누가 먼저 계산하는 지 겨루는거야. 절대 안질테니까. (괜히 부끄러움을 지우기 위해 과하게 파이팅을 넣었다가 자신의 덩치를 간과한 나머지 무릎에 부딪힌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다. 화들짝 놀란 사이에도 당신을 먼저 확인한다.) 그건, 조금 민폐…가 될 거 같아서. 역시 게임 안에서 만나는게, 덜 번거로울테고… (물론 당신과 만나는 건 좋지만, 기력이 쭉 빨리고 만다. 더군다나 게임 속도 아닌 현실이니, 더하면 더했으므로. 그러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뜬다. 그러다가 당신의 씁슬한 미소에 눈꼬리가 점점 처져,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능숙한 위로 같은 게 가능할 리 없다. 당신이 건네준 포스트잇을 붙인 마카롱을 받아들곤, 그 내용에 어쩔 줄을 몰라한다.) 아니, 난…산책, 방해할 거 같아서, 그래도 번호는 받아둘…게. (말을 더듬거리며 허둥거리다가도, 이내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마냥 포장된 마카롱을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간다.) ……마카롱을 볼 땐, 법사가 날 떠올려줬으면…좋겠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한 지도 모른 채 벌떡 일어섰다. 그야말로 놀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쓰지도 않고 당신보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물론 입구 쪽에 우뚝 멈춰서서 고장난 기계처럼 당신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곤, 전력질주한다.)
#으앙 귀여워ㅜ 보기에도 상냥하고 장난기 많을 거 같아! 이미지 고마워!
#나도 출처를 깜빡했네! 여기야! https://picrew.me/image_maker/295664 -
741 이름 없음 (mcdTGWrxrQ) 2020. 8. 26. 오전 2:31:46>>740
(원래는 쿨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었지만 실제로는 장난기가 그보다 더 많은 성격이었다. 물론 게임에서는 전자의 모습이 좀 더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현실. 장난을 치려 찡찡거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당신은 웃음을 참으려는것 같았다. 그냥 편하게 웃어도 될텐데, 하고 생각하던 중 당신의 무릎에 부딪힌 테이블이 흔들리자 덩달아 화들짝 놀라 어정쩡한 자세로 의자에 찰싹 붙는다. 잠깐 그렇게 멍하게 있다가 멋쩍게 웃으며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넘어간다.) 알았어. 알았어. 나도 절대 안질테니까 둘 다 열심히 해보자. (가볍게 파이팅을 외친다.) 음. 민폐는 아니지만 전사가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불러준다면 엄청 반가울것 같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을 배려해서 그 정도로만. 그리고 당신이 마카롱을 받아들며 하는 말에도 어쩔수 없다는듯 웃는다.) 딱히 산책 방해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그 번호로 연락하는거다? (손가락으로 마카롱 위의 포스트잇을 가리키다가 당신이 하는 말에 순간 동작을 멈추고 멍해진다.) .....어... 뭐? (그러나 당신에게 그 말의 뜻을 묻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저만큼 가버린 상태였다. 그 와중에도 뻣뻣하게 손을 흔들어 인사해주고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가는 당신. 당신이 사라진 그 자리를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솔직하게 빵 터져버린다. 좀처럼 멈추지않는 웃음을 애써 손으로 가리며 마찬가지로 카페를 나선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즐거워보인다.)
#귀엽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이걸로 막레가 된것 같은데 혹시 1:1로 더 이어나갈 생각이 있니? 일단 나는 지금 자러갈거라서 미리 인사를 할게! 굿밤!^-^ -
742 이름 없음 (SSJOkWy6Ig) 2020. 8. 26. 오후 1:05:04>>734
아서는 한동안 말 없이 가죽 가방의 끈을 만지작 거리기만 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건지, 그게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오직 노 젓는 소리만이 그녀의 이야기에 장단 맞추는 것 같았으며 고요히 울려퍼지는 물소리는 사뭇 적막한 기색을 낳았다.
"엘런 프랭크... 가문을 일으킨 영웅이죠. 무뢰배와의 전투에서 승리해 막대한 부를 소유했다고 배웠습니다.그리고 가문이 부흥하게 되었다고도..."
그는 세뇌받듣이 주워듣기만 했던 어린시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프랭크로서의 삶 밖에 모르는 아서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기에 그녀가 하는 말이 혼란스럽게만 다가왔다. 처음으로 프랭크가 아닌 다른 세계가 그의 앞에 열린 셈이었으며 그것이 악하고도 끔찍한 사연이었음을 안다는 건 최초로 느껴보는 부채감이었다.
"선장님, 제가..."
무얼 말할 수 있을까. 욕심에 (단순한 욕심은 아니었겠지만.) 눈이 멀어 가문을 멸망시킨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얹을 수 있을까. 아서는 자신의 신념이 시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사죄를 하기에 그는 아직 애송이였고 힘이 부족했다. 사과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 아서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말이 없었다.
순간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도는 배가 드러났다. 그 신비로운 배는 세이렌이나 크라켄의 전설처럼 있을 리 없는것을 떠오르게 했다. 아서는 배를 올려다 보느라 조금 전의 일은 잊은 듯 했다. 가슴이 뛰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직감했다.
갑판 위로 검게 탄 피부를 한 사내가 시시껄렁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나왔다. 작은 배에 탄 두 사람을 내려다 보더니 날렵하게 줄 사다리를 내린다.
"여어, 선장님. 오늘은 꽤 늦으셨습니다. 선장님 없는 배가 어색해 죽을 뻔했다굽쇼." -
743 이름 없음 (t9jfOz.6Og) 2020. 8. 27. 오전 12:06:00>>741
#늦어서 미안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이었어 ;ㅡ; 거기는 괜찮을 지 모르겠지만, 꼭 아무 일 없기를 바래!
#법사주만 괜찮다면 1:1로 이어나가보고 싶어! 오늘 당장은 힘들 것 같고, 괜찮다면 내일 저녁 즘 1:1 시트스레에서 보자! ^_^* -
744 이름 없음 (CDB6j5yMow) 2020. 8. 27. 오전 12:51:50>>743
#괜찮아! 비 때문에 고생했구나..... ㅠㅠ 여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것 같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사주도 조심하고 그쪽도 꼭 무사하기를 바래!
#전사주도 괜찮다면 나도 좋아! 그럼 내일 저녁 때 1:1 시트스레에서 만나자! 미리 굿밤이야!^-^ -
745 이름 없음 (PMXViy77oY) 2020. 8. 27. 오전 1:46:23>>742
"혹시 모를 일이야. 그 때 전리품으로 취했던 불경한 무언가가 프랭크 가문의 금고 안에 잠들어있을지..."
그녀는 사과를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가벼우면서도 마냥 가볍게만 듣긴 힘들지도 모를 농담을 하면서 그녀는 먼저 줄사다리를 잡았다. 아서에게 뒤따라 올라오라고 손짓한다. 줄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선체에 뚫린 포안 안에서 바쁘게 울리는 발소리와 연장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색하긴! 나 없다고 탱탱 놀던 건 아니고? 어쨌건 홉스! 신입이 왔으니 당장 상급 선원들을 불러모으게! 멋진 자기소개 한 마디를 준비해서 말야."
갑판 위에 발을 디딘 그녀는 홉스에게서 트리코른을 받아 머리 위에 눌러쓴다. 트리코른의 한 면에는 웃고 있는 부두 인형이 꿰메어져 있었다. 또한 배 위에서 밧줄을 당기고 풀고 묶으며 높은 돛대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위 '선원'이라 불리는 것들은 총기를 잃고 피부가 갈라진 좀비들이었다. 그들은 항명하지도 지치지도 않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선원들이리라. 그나마 그들을 통제하는 상급 선원들까지 좀비는 아닌 건지, 개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간간히 보였다.
그녀는 연극에서 그리하듯 과장된 어조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다.
"이쯤에서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지. 내 이름은 레오니 홀린. 이 배의 선장이자 홀린 가문의 대를 잇는 적법한 적장녀일세. 비록 뿌리 뽑힌 나무의 잎사귀처럼 바다 위를 떠다니지만 선조의 뜻을 잇는 의지만은 파로스 등대의 불꽃처럼 선명하다네."
"우리는 옛 유물과 전설, 의식을 따라 온 세상의 외지고 버림받은 섬과 바다를 뒤지고 있네. 그리고 최근에서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
"이 시점에 자네를 만나게 되니 이는 분명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결과라....... 프랭크 가의 공자 아서 프랭크, '이성' 호와 선장을 비롯한 선원 일동은 당신을 환영하네." -
746 이름 없음 (ZMilDNkvEY) 2020. 8. 27. 오후 8:29:57>>745
농담과도 같은 그녀의 말투는 얼핏 냉소적이었고, 그렇기에 사람을 절로 긴장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었다. 잠시 배의 위용에 넋을 잃었던 아서는 그녀의 말에 힘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녀를 조용히 올려다 보았다.
홉스 스텐리, 요령 좋고 솜씨도 좋은 이 배의 일등 항해사는 나름대로 숙련된 자세로 경례를 해 보이고는 박수를 치며 큰 목소리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아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거대한 갑판 위를 눈 안에 담았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는 시체들과 시선이 마주쳤다.
"유... 유령선...! 말도 안돼! 이런게 실존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서의 시선에 뒤늦게 선장의 호방한 표정이 들어온다. 부두술을 이용해 배를 움직이는 옛 귀족가의 마지막 생존자, 어떤 전설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지는 않았다! 아서는 푸른 눈을 크게 뜨고서 이 놀라운 비밀을 양 눈에 담았다.
홉스가 선장의 발표에 언뜻 눈썹을 꿈틀거린다. 그러나 호쾌한 성격으로 금새 선원들을 끌어모으며 새로운 선원을 위한 유쾌한 멘트를 쏟아낸다. 갈빛으로 탄 선원들이 흥미를 가득 담은 시선으로 모여들었다.
"자, 저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프랭크 가의 사악한 마수를 뚫고 꿈을 쟁취하러 나타난 희대의 용자! 아서 프랭크 되시겠다! 다들 박수로 맞이하도록!"
수런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선원들을 바라본다. 어설픈 박수로 환영하는 이들이 반,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이들이 나머지 절반이다. 흰 얼굴을 새빨갛게 달으며 허리를 꾸벅 숙이는 아서는 퍽 어설퍼 보인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앗!!"
그 모습에 와하하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몇 안되는 상급 선원들이 시끌벅적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 곧 홉스의 호령에 선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더니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다. -
747 이름 없음 (Y5eHa8UfI.) 2020. 8. 30. 오전 4:10:52샛노란 달이 하늘을 환히 밝히고 있는 밤. 악마는 이런 밤을 좋아했다. 낮의 햇빛과는 다른 은은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해가 아닌 달이 밝히는 세상을 내려다보던 악마의 눈은 좋아하는 경치를 즐기는 시선과 동시에 자신의 즐거움을 좀더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었다. 악마의 손톱이 파고들어가 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빈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아. 찾았다♪"
저멀리 달빛을 한가득 실은 채 조용히 흐르는 강가를 보고 악마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야말로 악마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보였다. 그 사람의 마음의 틈새는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상실감'으로 인한 빈틈. 악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걸 어느 악마보다도 잘 했다. 누구보다도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악마가 찾은 사람은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을 신경쓰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들킬 염려도 없이 그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 그 사람의 마음에 빈틈을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밤의 어둠 속이라도 뚜렷히 알아볼 수 있게,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그리워할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안녕? 오랜만이네."
악마는 친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목소리마저 똑같이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만든 모습 만든 목소리로 앞에 있을 사람을 향해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제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저 사람에게서 나올 반응을 마음 속 한가득 기대하면서.
//악마가 흉내낸 모습은 사별한 연인 정도로 생각하고 이어주면 될거같아! -
748 이름 없음 (/QyK/IjrgE) 2020. 8. 30. 오후 12:04:59>>747 악마의 표적이 된, 강가에서 발을 담구며 풀뿌리를 씹고 있던, 비쩍 마른 체구의 여행자, 아니 난민에 가까워보이는 행색의 그는, 악마를 보자마자 풀뿌리를 툭 떨궜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악마를 바라보던 그는...
"이게 웬... 웬...!"
말을 잇지도 못하고 군침을 삼키더니, 악마에게 달려들어... 콱 깨물었다.
그랬다. 그가 절절히 그리워해 마지 않던 대상은 바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맛보았던, 최근에는 꿈에까지 나와서 나를 먹으라 말을 걸었었던 칠면조 구이였다. 꿈 속에서처럼, 칠면조 구이가 잠깐 말을 걸어왔었지만, 그 사실은 먹음직스런 모습과 군침도는 향에 홀린 난민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
749 이름 없음 (Y5eHa8UfI.) 2020. 8. 30. 오후 1:23:01미안한데 >>748 이건 내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못 잇겠다... 스루할게...;;
>>747 관심있는 사람 이어주길 바라! -
750 이름 없음 (/QyK/IjrgE) 2020. 8. 30. 오후 1:49:38>>749 아, 그랬구나. 좋은 하루 보내!
-
751 이름 없음 (u3G6QC0BFY) 2020. 9. 1. 오전 1:25:52>>747
"네 오랜만이네요"
그녀 또한 자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같이 춤이라도 출까요?"
먼저 치마를 걷어 스텝을 밟는다.
유려한 선을 그듯 발을 움직이며 팔을 흔든다.
나부끼는 붉은 머리카락이 장미 같이 아름다웠다.
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높은곳으로
'철의 여인' 릴리스
천민으로 태어나 지금은 4대명가의 공작부인이 된 유일무이한 여자
기이할 정도로 태평한 이 여인의 얼굴은 악마의 장난 따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무너져버린 폐허속에서 더이상 부서질것도 없이 망가져버린 마음이기에 가능했던것 일수도....
"당신을 죽여버린 이후로 어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 주시는군요...지옥은 그렇게 한가한 곳인가요?" -
752 이름 없음 (AnS0R8uM8E) 2020. 9. 4. 오후 4:39:34필터끝까지 태워진 담배가 희미한 불빛을 내며 손끝에서 타들어간다. 저녁노을이 붉은 띠를 진 거리에서는 담배의 불빛마저 희미했다. 어쩐지 가슴속은 한산하고 허탈해서 태운 연기를 뱉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어느새 몰려온 구름이 검은 물줄기를 뿌리고 있었다. 저무는 하루의 희미한 여명 사이로 거뭇하게 물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네온 사이를 달려 가게로 돌아갔으나. 갑작스레 뿌리는 빗줄기에 옷이 젖어서 유니폼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꼴로 가게로 들어서니 주인의 박한 시선이 그대로 내리꽂혔다. 어차피 이제 와서는 팔리지도 않는 막고기를 판매하는 주제에 점원에 대한 관리는 일류 레스토랑 만큼 철처한 까탈스런 아저씨였다. 나는 고개를 어정쩡하게 떨구며 인사를 했고, 유니폼이 젖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리실로 들어갔다. 조리실 안에서는 끓여지는 스프 냄새가 주방 안팍에 스며들었다. 뼈까지 고아 만든 특제 스프는 내 구역질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때 우리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담긴 스프를 꺼내 패키지에 담아냈다. 우리는 인간 중에서도 제일 저질의 품질을 자랑하는 싸구려 인간을 파는 가게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동물의 우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 때 벌어졌던 사건이 있던 이후로 동물들은 타고난 무력으로 인간들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없다고 모두들 기뻐하지만, 나는 아직도 인간을 옛 우리들의 모습처럼 만들어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은 부류다. 결국 나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인의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빗속과 어지러운 네온 사이를 달리며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런 현실은 싫다.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인간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바보같이 여겨지던 그 때는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던 현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동물들의 지능이 발전하고 인류를 뛰어넘게 된 이후로 그 때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다. 삭막하기만 하다.
그런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났다. 낙담에 젖은 비 속에서 네온과 함께 나타난 당신이 있었다. -
753 이름 없음 (wGyNqKJ7ro) 2020. 9. 4. 오후 7:42:35>>752
그 사건 이후 여자는 길바닥을 떠돌았다. 그녀가 시간을 내어 돌보았던 길고양이들처럼 먹을것을 훔치고, 눈과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숨어들고, 그녀를 괴롭히는 동물들, 혹은 인간들로부터 달아나야 했다. 여자는 늘 굶주렸고, 제대로 잠들고 쉬지 못했다. 몸에 걸칠 제대로 된 옷 하나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고민은 사치였다.
오늘은 운이 나쁘게도 비가 왔다. 빠르게 비를 피하려 했으나 여자가 걸친 누더기는 이미 비에 쫄딱 젖어 있었다. 벌써 이틀째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나마 내리는 비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다행인 점일까. 상처 투성이에 지친 얼굴을 한 채 멍하게 떨고 있던 여자가 이내 작은 처마 아래에 몸을 숨기는 걸 포기하고 몸을 적셨다.
위생을 챙기지 못하게 되며 잔병치레가 많아졌다. 여자가 빗물에 대충이나마 몸을 씻어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감지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네온사인 아래로 걸어 나갔다. 인간에게 우호적인, 마음씨 좋은 동물이라면 무언가 먹을 것을 던져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잠깐이나마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 너는. 그의 얼굴을 확인한 여자가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마루…….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일까. 제 멋대로 붙였던 그 이름 대신 네 마음에 드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건 이후 내내 꿈에서도 그리며 걱정하던 얼굴. 일에 휘말려 다친 곳은 없는지, 밥을 잘 먹고 다닐지. 내가 너를 잃어 이렇게 아픈 것처럼 나를 그리워하지는 않을지.
늘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내 다정한 가족. 햇볕 아래에서 그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다가 함께 낮잠에 빠져 들 때도 있었지. 비록 이제는 가물거리는 과거에 불과해졌지만.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
754 이름 없음 (zfrve3Jrkw) 2020. 9. 5. 오후 5:27:00>>753
그녀와 처음 만났던 것은 오늘처럼 어둡고 비가 내리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상처를 입은 것 처럼 비틀거렸지만 실상은 배가 고파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때도 오늘과 같은 네온 사이로 너는 걸어나왔다. 이제는 익숙해진 우산을 쓰고 날 선 내가 그녀를 겁내지 않도록 사료와 물을 두고 멀리 떨어지던 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날이 잦아질수록 나는 그녀와 가까워 졌고, 어느날 그녀의 손에 이끌려 낯선 집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녀의 집이었던것 같지만 당시에는 낯선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꽤 행복했다. 나는 그녀가 햇살 아래에서 내 털을 쓰다듬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는 그녀가 다시금 내 앞에 손을 내밀고 있었다. 잔뜩 더러워져서 꼬질대는 몸을 하고. 어디서 도망 온 걸까? 어디로 가려는 중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이제는 동물들도 악수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는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에 의문을 품거나 제지를 걸지는 않았다.
"메이, 네 이름 맞지?"
우리는 곧 공용의 언어를 위해 우리들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었다. 그게 바로 목에 걸린 초커로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대신에 다시 목에 목줄을 걸었다. 그녀의 목에는 초커가 걸려있지 않았으니, 내 말이 야옹이라는 것 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개들과 달리 목줄이 낯설어서 익숙해지는데 진을 뺐다. 그런 부적응적인 성향을 들어 구직관계자는 나를 저급 음식점에 취직시킨 것이다. 나는 일단 그녀를 어딘가에 숨겨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 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잘 따라오고 있나...?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나는 작고 털 투성이인 검은 손을 까딱이며 다른 동물들에게 들통나지 않게 건물 지하로 이어진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은 친구인 토토와 함께 지내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토토와 나는 이 시대로 치자면 반전분자로 세상을 다시 인간 손에 돌려놓으려는 자들이다. 토토는 아마도 일본인 할머니와 오래 살았던것 같다. 개라서 초커가 익숙하지만 인간을 박대하는 환경을 버티지 못해 작은 사무실에다닌다.
"마루,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토토는 눈치가 빠른 개였다. 서둘러 문을 잠그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런뒤에야 겨우 안심하고 마주 앉은 우리 셋은 종이와 펜을 놓아둔 채, 엄숙한 분위기로 말을 꺼냈다.
"메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야옹 야옹, 그녀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겠지. 그러자 눈치 빠른 토토가 영어로 스케치북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Where are you from?
영어는 인간들의 공용어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답을 기다렸다. -
755 이름 없음 (tpH8nLUR5g) 2020. 9. 7. 오전 4:12:39강하게 나부끼는 바람속 당신은 터덜거리며 날씨를 홀로 맞써고 있습니다.
이 날씨같이 갑작스런 이유일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비를 할 수 없었을수도 있고 여간 그런 당황스런 당신앞에 거센 빗속에서도 휘황찬란한 빛이 커튼사이로 새어 나오는것 거대한 호텔이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 영업을 하는 중인것 같네요!
원래 계획에는 없는 상황이지만....당신에게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밖은 사람 한두명은 거뜬히 잡아먹을것같은 거대한 폭풍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잡아먹혀도 따뜻한 호텔속이 낫지않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훈풍이 당신의 옷을 감싸쥐고 데스크의 친절한 직원 또한 따스하게 웃으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겉만큼이나 안도 번지르르한게 모든 기둥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근처의 투숙객들도 번지르르한 옷차림을 보아하니 돈좀 있어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서오세요 호텔 '그랜드 페스티벌' 입니다.
예약하신 성함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756 이름 없음 (0vGm9zR/FU) 2020. 9. 10. 오전 2:52:37갱신
-
757 이름 없음 (ANtq2FKpT6) 2020. 9. 25. 오전 11:54:07속절없이 내리는 비에 옷 속까지 다 젖어버린다. 재해는 언제고 사람의 나약함에 파고들어 기생하는 벌레처럼 그들을 갉아먹었다. 그는 종군기자 출신이었다. 사람이 내몰리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인간은 가장 약한 때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 생물이었다. 그는 군의 만행과 시민들이 패닉하는 모습 하나 하나를 사진기에 담았으며 죄책감을 안고서도 기어코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감정에 억눌린 채 살아남은 삶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하루 하루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날 상담사가 말했다.
"개를 키워보면 어때요?"
그날 바로 유기견 보호소로 찾아갔다. 나는 무수히 많은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다. 그들의 곁에는 내가 봐 왔던 죽음의 그림자가 마찬가지로 드리운 것 같았다. 우울했고 침울했으며 기력이 없는 모습들로 지나가는 사람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 녀석의 투쟁적인 눈동자는 마치 오래 전에 떠나간 친구를 떠오르게 했다. 나는 홀린듯이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름은 친구의 것으로 지었다. 맥, 그 녀석과의 만남이었다. -
758 이름 없음 (d0Y2VT3Tjo) 2020. 10. 2. 오후 8:16:04“쉿. 그들이 옵니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 무덤을 기어다니는 뱀의 취릭 소리, 털 하나 없는 4개의 날갯소리, 그런 이질적인 소리들 사이에서도 인간의 발걸음소리 하나가 귓가에 들려왔다. 민간인을 그대로 위험지역에 들여보낼 수는 없어, 약간의 위험을 감당해낸다. 지나가던 당신의 입가를 막고, 골목으로 끌고오다시피 해 원래 숨어있던 은신처인 편의점 안으로 데려왔다. 거기까지 가고 나서야 당신을 풀어주고, 해칠 의사가 없다는 듯 양손을 들어보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미안합니다.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짧은 머리에 흙먼지로 덮인 얼굴이었지만 앳되보이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명찰이 달린 군복을 입고있었다. 등에 소총까지 메고서.
“괜찮다면 스테이터스 점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직업은 군인입니다만, 의무병이었기에 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
759 이름 없음 (PSz/NE331I) 2020. 10. 3. 오전 2:46:11>>755 <당신>은 이미 새파랗게 젊으나 뻣뻣한 수염은 액면가를 30대로 밀어올리고 있다. 껴입은 점퍼는 대학 새내기들의 소재인 데님이지만 어깨선이 실제 어깨의 한참 아래에 위치한 데다 그나마도 지난 시대 디자인이다. 모진 바람에 시달리고 나서 더욱 후줄근해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흙탕물과 땀, 낡은 모자, 담배, 짚, 싸구려 종이, 박하, 그리고 약간의 피 냄새를 <당신>은 흘리며 직원에게 걸어간다. 손은 비었지만, 투숙객들은 도끼를 든 사람을 본 것 같이 피해 갈라진다. 직원은 예외다. 그 혹은 그녀는 데스크에 갇혀서 도망갈 곳이 없다.
"이 호텔 예약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어요."
팔꿈치를 데스크에 붙이고 손을 비비며 말한다. 습관이다. 손가락이 맞닿은 자리에서 마른 흙이 가루져 떨어진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눈빛을 직원의 것과 교환한다. <당신>은, 데스크에 있는 그 또는 그녀가 눈치챈 것과 같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을 하고, 무진 불쾌하게도, 얼굴의 온 근육을 환한 미소로 일그러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깨끗한 침대와 객실이 절실한 사람은 있답니다. 지금 나는 무척 지쳤거든요. 남은 방은 있나요?"
<당신>은 물이 괸 눈으로 직원 뒤에 매달린 열쇠를 응시한다. 그것이 장식용인지 객실용인지 궁금해하면서.
<당신>의 이름은 마틴이라 한다. -
760 이름 없음 (D45eTwB5jE) 2020. 10. 3. 오전 3:21:16사랑에 빠진다고 세상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날씨는 예보대로 화창하고, 막히는 도로는 늘 똑같이 막히며, 재수없는 인간은 역시나 엿 같이 굴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황은 그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한두 번도 아닌 주제에 매일 처음인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탔다. 어느 날엔 좋아 죽겠어서 당장이라도 고백하겠다고 설치다가 또 어느 날엔 이까짓 마음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지 생각하며 존버를 외쳤다. 나의 지금 상황은 그 중간의 어드메쯤. 확 내질러서 죄다 끝장을 보고 싶은 마음 반, 이 지지부진한 마음을 끌고 가다 이게 다 닳아 없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나는 지금, 10년도 더 넘게 알고 지낸 소꿉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다.
처음 만난 건 고등학생 때. 그때부터 꽤 다정했던 걸로 기억한다. 사춘기 특유의 틱틱대는 건 있었어도 또래 남자애들치곤 착한 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매일 사귀냐고 놀려대는 짓궂은 장난에 손가락욕 하나와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하고 말아버렸다. 그건 걔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의 속이니까 알 길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학생 때 마음이 생겼느냐? 역시 아니다. 과는 달랐지만, 같은 학교에 입학한 덕에 점심을 같이 먹고 교양수업 몇 번 맞춰들은 게 전부다. 각자 연애도 열심히 했다. 비록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둘이 만나보는 건 어떠냐는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대응은 고등학생 때와 비슷했다.
서로의 첫사랑과 첫연애, 구질구질하다 못해 추하던 첫이별의 후폭풍까지 죄다 지켜봤는데, ……내가 얘를? 처음 깨달음이 왔을 때엔 부정했다. 며칠 답장도 안 해보고 무시도 해봤는데, 서운하다는 한 마디에 포기해버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화가 났다. 그놈의 다정함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왜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건지.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야속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긴 왜 웃어. 하긴, 알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이 편이 낫나.
"어어, 왔냐."
무심한 척 인사를 던지며 무거운 발을 이끌고 네게 걸어갔다. 천천히 가까워진 우리는 만나기로 한 호프집 앞에 멈춰 섰다. 네 구둣발이 그림자 끄트머리에도 닿지 않았는데 내 심장을 지긋이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전히 중증이구나.
“일단 들어가자.”
고개를 끄덕인 네가 먼저 가게로 들어간다. 문을 잡아주는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저릿하다. …그냥 손잡이에 이마 부딪히게 내버려두지. 얼굴에 난 손잡이 모양을 보고 실컷 비웃기나 하지. 작게 한숨을 쉬곤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인데.”
메뉴판을 뒤적거리며 물었다. -
761 이름 없음 (2sNaHbITJM) 2020. 10. 3. 오전 4:43:41>>760 "줄 게 있어서 말야. 그 전에 뭐 좀 시킬까?"
내 앞에 앉아 퉁명스레 말하며 메뉴판을 뒤적이고 있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다.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란 없다, 그런 소리도 있지만, 그건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닐까. 서로의 태도가 기호에 맞는다면 사회적 성별같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한 색안경이나 끼고 보는 친구들이 있긴 했다. 고등학생이면서 그렇게 꽉 막혔다니 이상하긴 하지만, 나라고 그 시절에 덜 이상했던 것도 아니니까.
호프집에서 볼 때면 늘 먹던 대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뒤, 종업원이 자리를 떴다. 품에서 청첩장을 꺼내, 아직 생수가 담긴 병과 잔, 휴지곽 만이 올라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이를 드러내고 씩 웃으며 말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시은이는 오늘 야근이라서 시간을 못 냈어. 식 전에 같이 얼굴 보고 싶었다는데 미안하다고 전해달래고. 시간 나면 와주면 좋겠다."
의문이 좀 풀렸으려나? 아무리 10년지기 친구라도 간만에 만나서는 실실 웃고 다니면 얘 결혼하나보다, 하기보다는 미친 거 아닌가 싶을 테니 말이다. 그나저나 한잔 하고 시은이 데리러 가려면 택시 타야겠네. 결혼식 준비하랴, 일하랴, 피곤하고 힘들테니 가는 길에 케이크라도 사 가야겠다. -
762 이름 없음 (5vvjxZudrQ) 2020. 10. 10. 오전 1:32:29적당히 해. 확 고백해버릴라. (책상 너머로 치근덕거리는 너의 이마를 투욱 밀며 미니 선풍기의 바람을 제 목가 부분에 독차지하고 있다.)
-
763 이름 없음 (6ntVJuKpFU) 2020. 10. 10. 오전 2:59:31누군가가 >>762 에게 똥을 던졌다.
-
764 이름 없음 (/9j21o54Z.) 2020. 10. 10. 오후 6:36:20>>762에게 날아가는 똥을 보며 한 학생이 입을 막고 숨을 삼킨다. 막아주기에는 거리도 멀고 차마... 엄두가 안 난다. 그저 피하기만을 기도하며 고개를 돌린다.
-
765 이름 없음 (EIiv6kLyBk) 2020. 11. 12. 오후 7:34:24나, 외로워.
우리의 침묵을 깬 건 나의 그 한마디였다.
오늘은 천천히 흐르는 나른한 오전이었고 하늘거리는 투명한 커튼 사이 내리쬐는 맑은 햇살이 일렁였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그것을 잡겠다고 하릴없이 손을 휘적여보다 울렁거린다고 생각했다, 햇살이.
나는 침묵을 깨었기에 너의 반응에 호기심이 생겼다. 여전히 침대 위에 축 누운 채로 고개만 위로 까딱 들어 눈동자를 굴렸다. 작은 움직임에 부드러운 검은 머리칼이 사락 떨어져 눈가를 가렸다. 그 사이로 너와 눈을 깜박 마주하며 나는 푸스스 웃었다.
"나, 외롭다고."
나와 달리 책상에 반듯히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는 너에게 나는 어리광을 부렸다. 나는 희고 가느다란 나의 두 팔을 쭉 뻗어 너를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네 목선을 따라 찰랑거리는 너의 안경줄을 눈으로 좇을 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항상 책과 함께 따뜻한 무언갈 머그컵에 담아 마시며 뜨겁게 데워진 네 손도. 그것은 내 것이니까. 너의 온도, 오로지.
오로지.
-
766 이름 없음 (zJaN07E7oY) 2020. 11. 13. 오후 12:22:17>>765 "아, 또 시작이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험서와 씨름을 하고 있자니, 뒤에서 외롭다 외롭다 노래를 부르는 호적 메이트의 목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집안형편 때문에 둘이서 좁아터진 한 방을 쓰는 거야 그렇다 쳐도, 취업준비중인 걸 뻔히 아는데도 방해를 해대니 울화통이 치밀었다. 신경질적으로 수험서를 탁 닫고 가방을 쌌다. 집안형편도 어려운데 빈둥대고 있는 것도 철없지만, 취업 준비하느라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라도 있을 것이지. 침대 위에서 뒹굴대는 작태를 한번 노려본 뒤, 가방을 매고 방을 나섰다. 오늘은 최소한 비는 안 오니, 바람이 세게 불지만 않으면 놀이터 벤치에서 공부하다가 알바하러 가야겠다. -
767 이름 없음 (vpBeNHBZzA) 2020. 11. 13. 오후 1:23:55난 입을 떼어 K선생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K선생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당신을 봤다. 내 얘기가 끝나기 전까지 입도 벙긋하지 않겠다던.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다.
어디 보자. 내가 다시 운을 뗐다. K선생은 처음부터 열정이 넘쳤어요. 초임교사다웠죠. K선생의 전공은 생물학이었는데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할 돌고래나 원숭이의 생태에 대해서 침이 튀도록 강의했어요. 우리 중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은 세어 봤자 한 둘.... 그리고 우리에 대해 알고나서 부터는 우릴 구하고 싶어 했어요. 지하에서 생을 마감할 우리들의 운명이 K선생의 눈에 가여워 보였던 거겠죠. K선생은 어느날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바다에도 산에도 너희들이 가고 싶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교무실에서 K선생과 다른 선생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K선생은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약속을 했다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돌아와서 너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떠나가서 몇 년이 흘렀어요. 당신이 갑자기 찾아와서 K선생에 대해 묻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유가 뭐죠? K선생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마주보았다. 당신은 조금 웃는 것 같이 보였다. -
768 이름 없음 (omhn3rMHNw) 2020. 11. 13. 오후 1:52:01>>767
그제서야 그는 입을 연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웃는다. 표정으로 웃는 것과 마음으로 웃는 건 엄연히 다르다. 그는 웃으면서 동시에 웃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죠. K선생이란 자는 죽었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생물을 좋아하고, 당신들에게 자유를 말한 K선생은 무덤에 묻혔어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그래, K선생은 죽었다.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은 K선생과 함께 관에 들어갔다. K선생은 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기분이 어떻죠? 그는 불현듯 묻는다. 그리고 또 문득, 주변을 둘러본다. 불쾌한 곳이다. 가능하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곳에서 돌고래의 생태를 가르쳤을 K선생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여긴 심해나 다름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폐가 갑갑하다. 그는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다. 사실, 그가 진심으로 웃어본 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다. -
769 이름 없음 (uWdjHp8JYc) 2020. 11. 13. 오후 2:17:59당신은 K선생의 죽음을 말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으니. 나는 쓸 것도 없으면서 책상에 놓인 펜을 어루만진다. 계획이 잘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열정이. 항상 모든 일을 밝혀주는 것만은 아니니까. K선생은 사실 무모했죠. 무모했어요. 그처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금방 죽어나가기 십상이에요. 나는 쓸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펜을 내려놓는다.
기분이요? 당신은 기분은 물었다. 기분이 왜 중요하죠? 나는 무릎에 놓인 손을 흐느적댔다. 정말 이상한 걸 물어보네요. 눈물이 괸 눈동자가 당신을 향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K선생을 향한 기분 같은 건. 나는 친구들이 K선생을 지지했을 때도, 비웃었을 때도 그에게 어떤 기분이라곤 가져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목이 메어 쉬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웃고 있기를 바랐다. 마치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는 듯이.
K선생은 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시키지도 않은 고백을 당신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당신이 아닌 K선생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들켰거든요. K선생은 그걸 알았는데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았고.... 나는 당신과 눈을 맞출 수 없었다. 어쩌면 내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눈을. 죽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내 비밀을? -
770 이름 없음 (omhn3rMHNw) 2020. 11. 13. 오후 3:08:36>>769
맞아요. 무모한 사람이었죠. 동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인다. 부나방은 촛불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오래 살 수 있었겠지. 하지만 K선생은 조금이라도 불꽃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택했다. 설령 날개를 전부 태워먹는 한이 있어도.
보통은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의 부고를 듣고 울지는 않죠. 그는 작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테이블에 놓인 휴지곽을 건넨다. K선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문객이 왔다. 그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펑펑 울고, 진정한 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생전의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그 사이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에게는 K선생을 위해 회상할 기억도, 흘릴 눈물도 없었다.
나는 들은 바 없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내저어 보인다. 이렇게 그가 모르는 K선생의 모습이 또 하나 늘어 간다. 학생의 비밀을 지켜 주는 교사. 기실, 상대의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K선생은 그와 어떤 것도 공유하려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이는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해졌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나요, K선생. 물음표는 없지만 명백한 질문이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K선생을 과거형으로 칭하는 데 익숙해졌다. 습관처럼 손끝의 거스러미를 잡아뜯는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뜯길 듯 뜯기지 않는. 딱, 딱. -
771 이름 없음 (WxZt5G/1fE) 2020. 11. 13. 오후 3:46:33나는 휴지곽에서 뽑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용도를 다한 휴지는 그저 흐물거리는 펄프 덩어리였다. 그럼 K선생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는 새에요. 늘 다치고 나서 한참 후에 아프고 잃고 나서 후회해요. 고쳐지지가 않네요. 나는 휴지를 마저 뽑아 코를 풀었다. 시끄러웠죠. 실례해요. 눅눅한 휴지들이 휴지통 밑바닥을 채웠다.
K선생은 적어도 약속 하나는 지켰네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요. 나는 당신의 눈을 봤다. K선생과 상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 K선생을 무척 좋아했죠. 사실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요. K선생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쳤는데 K선생은 그걸 밖으로 새게 했다나. 오래 전에 잊혀진 친구.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어떤 거짓말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친구가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만 알죠.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부터 K선생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나는 당신의 얼굴 표정에서 공감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비밀을 들켰던 건 순전히 사고였죠.
글쎄요.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을 들여다봤다. 내 손이 아파오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어떤 친구는 K선생을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들었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아까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배신자였겠죠. 나는 책상에 팔을 올리고 서서히 눈을 떴다. 전등 아래 내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나한테 K선생은.... 말이 끊겼다. 나는 당신의 손버릇을 지적했다. 그보다 손. 보고 있는 내가 더 아프네요. 조금 더 시간을 소요하고서 나는 말했다. 당신도 K선생의 관계자죠. 당신에게는 어땠어요? K선생은 좋은 사람이었나요? -
77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1:36요들레이
-
77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1:53이간질
-
77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2:06질경련
-
77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2:41련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잖아
-
77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2:52아헤가오
-
77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3:05오나니
-
77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3:31니삭스
-
77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3:49스레딕 운영자야 자살해
-
78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4:01해먹
-
78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4:14먹사니
-
78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4:28니미씨발
-
78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4:40발정
-
78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4:51정액
-
78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5:05액기스
-
78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5:16스섹
-
78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5:35섹스라고 쓸까요 말까요
-
78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5:46요들송
-
78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6:05송이버섯이라고 쓰면 끝낼 말이 없어
-
79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6:16어묵
-
79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6:45묵사발
-
79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7:09발바리
-
79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7:23리트라이
-
79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7:39이편한세상
-
79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7:52상황극판
-
79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8:04판치라
-
79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8:18라팡
-
79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8:29팡야
-
79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8:40야동
-
80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8:52동심파괴
-
80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9:03괴뢰국
-
80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9:24국뽕에 취한다
-
80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9:35다이묘
-
80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39:48묘비
-
80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0:00비선실세
-
80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0:12세레비
-
80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0:37비주류에 속한 나
-
80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0:49나 자살하고싶어
-
80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1:00어학사전
-
81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1:15전부 다 쓸모없다구
-
81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1:24구라미
-
81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1:42미술
-
81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1:54술탄
-
81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2:06탄광
-
81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2:23광어회
-
81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2:32회무침
-
81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2:44침소붕대
-
81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2:54대딸
-
81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3:10딸딸이 그만 쳐
-
82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3:22쳐먹는다 오오
-
82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3:31오나니
-
82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3:43니애미 느개비
-
82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4:00비빔면
-
82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4:12면사무소
-
82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4:23소자
-
82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4:37자살
-
82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4:51살인마
-
82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5:05마! 자살해라
-
82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5:21라디오헤드
-
83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5:31드레이크
-
83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5:45크레인
-
83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6:02인지는 하는데 그래도 자살마려워
-
83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6:12워마드
-
83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6:29드라이자살
-
83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6:44살코기
-
83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6:56기기변경
-
83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7:08경계선
-
83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7:22선 넘지 마라
-
83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7:39라오스
-
84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7:54스레딕 운영자 병신
-
84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8:04신발장
-
84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8:13장인
-
84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8:23인감
-
84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8:33감나무
-
84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8:46무기
-
84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9:02기린이라고 쓰면 할 말이 없어서 개복치
-
84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9:12치료제
-
84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9:25제적
-
84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9:38적화통일
-
85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49:52일회용
-
85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0:04용암동굴
-
85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0:15굴라그
-
85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0:28그림자
-
85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0:39자지
-
85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1:03지렁이라고 쓰면 중복
-
85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1:14복날
-
85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1:28날치알
-
85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1:41알탕
-
85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1:53탕수육
-
86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2:07육개장
-
86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2:40장이
-
86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2:53이스탄불
-
86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3:03불알
-
86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3:17알토란
-
86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3:45란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나보다
-
86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3:59다다익선
-
86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4:24선을 그어요
-
86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4:34요참형
-
86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4:45형태
-
87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4:55태국
-
87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5:07국까
-
87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5:17까메오
-
87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5:30오가피
-
87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5:51피해망상 때문에 자살하고싶다 시발
-
87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6:03발적화
-
87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6:14화질구지
-
87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6:39지랄하네 자살 말고는 노답이야 시발
-
87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6:55발기
-
87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7:08기출문제
-
88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7:19제외
-
88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7:31외부인
-
882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7:42인강
-
883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7:54강간
-
884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8:05간음
-
885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8:24음유시인
-
886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8:37인간지네
-
887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8:55네고
-
888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9:07고자
-
889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9:21자살충동
-
890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9:35동치미
-
891 이름 없음 (.d9velIe.I) 2020. 11. 13. 오후 11:59:52미친년아 고나리질 그만 해
-
89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0:03해돋이
-
89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0:17이성
-
89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0:32성인용품 딜도
-
89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0:54도미
-
89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1:06미켈란젤로
-
89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1:19로동신문
-
89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1:32문과생은 자살해야지
-
89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1:43지니
-
90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2:02니미럴 얼얼
-
90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2:14얼음
-
90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2:24음서제
-
90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2:42제일 좋은 방법은 자살하는거
-
90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2:54거위
-
90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3:14위자료 내기 싫어 하지말자
-
90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3:25자위
-
90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3:39위험물
-
90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3:51물고기
-
90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4:02기찬
-
91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4:12찬양
-
91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4:23양갈비
-
91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4:34비페미
-
91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4:56미천한 놈 자살해 빨리
-
91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5:06리본
-
91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5:22본디지
-
91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5:43지문
-
91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5:57문예
-
91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6:21예민한 새끼야 목 매달아 뒤져저저저저젖
-
91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6:31젖소
-
92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6:53소중이
-
92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7:08이렇게 응응
-
92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7:20응용 프로그램
-
92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7:33램 어린양
-
92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7:49양털
-
92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8:01털뭉치
-
92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8:10치골
-
92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8:21골반
-
92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8:32반장
-
92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8:50장 지지기 전에 자살좀
-
93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9:02좀벌레
-
93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9:14레몬에이드
-
93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9:24드래곤
-
93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9:37곤룡포
-
93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09:49포돌이 여깄네
-
93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00네코마타
-
93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10타살
-
93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21살인마
-
93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33마개조
-
93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44조리원
-
94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0:55원피스
-
94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1:17스레딕 운영자 제발 운영 그만해
-
94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1:36해헤 스레딕 운영자 유리멘탈
-
94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1:50탈리스커
-
94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2:04커져라
-
94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2:15라식
-
94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2:38식사하기싫어 쳐먹기싫어
-
94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2:53어 근데 무슨 단어를 쓸까
-
94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3:05까방권
-
94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3:19권총
-
95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3:30총수
-
95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3:41수비대
-
95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3:51대물
-
95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4:03물핥빨
-
95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4:15빨래판
-
95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4:25판모로
-
95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4:36로비
-
95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4:46비오는날
-
95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5:01날계란
-
95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5:20란아 어딨으 크흡
-
96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5:36흡반
-
96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5:52반찬이 왜 이따구야
-
96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6:08야 너희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구
-
96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6:19구라
-
96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6:37라플레시아
-
96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6:48아날
-
96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7:00날고기
-
96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7:13기면증
-
96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7:26증오
-
96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7:37오나홀
-
97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7:48홀후추
-
97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8:05추어탕
-
97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8:17탕비약
-
97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8:29약국
-
97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8:43국립공원
-
97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8:56원시시대
-
97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9:11대출
-
97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9:21출혈
-
97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9:32혈서
-
97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9:45서면
-
98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19:57면마스크
-
98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0:09크림반도
-
98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0:21도가니
-
98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0:33니애미
-
98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0:44미개
-
98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0:55개새끼
-
98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1:15끼니 다 쳐먹기 싫어 씨발아 뒤지게 놔둬
-
98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1:30둬 뭘둬 병신
-
98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1:42신상털이범
-
98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1:58범죄자
-
99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2:10자기기만
-
99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2:22만삭
-
992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2:47삭발 빈혈때문에 자살한다
-
993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3:01다 꺼져 자살할거야
-
994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3:22야동좀 치워줘 자살전에
-
995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3:34에로
-
996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3:47로션없다 자살해
-
997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3:59해금
-
998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4:11금지어
-
999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4:24어문아자살
-
1000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4:39살인미수보단자살
-
1001 이름 없음 (xDCnAWXMgE) 2020. 11. 14. 오전 12:24:54살기싫어자살